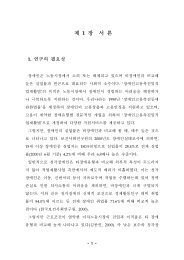빈곤과 양극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빈곤과 양극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빈곤과 양극화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 ∘책임정당․정책정당․민생정당․진보정당이라는 정치적 위상을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진영과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제출이라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재정립∘연초 당의 기본노선과 정책방향을 시민사회진영과의 논의속에서 사회적 의제로 끌어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및 정치사업으로 지속시키며 9월 국정감사, 진보예산으로 성과를 이어나감∘2005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화두 중 하나인 ‘<strong>빈곤과</strong> <strong>양극화</strong> 문제’를 집중적인 대사회적 의제로 쟁점화하고, 그동안당이 제시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것을 통해 타당과의 차별성을 시도2. ∘각 시민․부문․민중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민주노동당 주최로 개혁진보정책을 논하는 ‘사회개혁포럼’∘일상적 정치사업과 2004년 국감기간 동안 형성된 ‘개혁네트워크 활동의 총화’∘2005년 민주노동당의 기본 노선과 방향 및 핵심 정책을 사회적 의제로 확대시키는 ‘사회적 연대의 장’- ii -
첫째날: 3월 8일 화요일 •개회사: 주대환(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인사말: 천영세(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모두발언: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여는 토론]IMF이후 한국사회 빈곤의 새로운 경향:노동빈곤, 반복빈곤,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대 및 확산•사회: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실장)•발표: 김종건(서울신학대 초빙교수)•토론: 유정순(빈곤문제연구소장)김미곤(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교육]교육불평등의 현황과 대안•사회: 문성준(민주노동당 정책국장)•발표: 이철호(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토론: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노옥희(울산광역시 교육위원)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의료]사회적 <strong>양극화</strong>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로드맵과 그 실현 과제•사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발표: 임준(가천의대 교수,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토론: 유원섭(을지의대 교수)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이상이(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노동]<strong>빈곤과</strong> 일자리•사회: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실장)- iv -
•발표: 김성희(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토론: 주진우(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황인철(경총 사회정책팀장)정태면(노동부 고용정책과장) [장애인]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문제점과 과제•사회: 이민종(변호사)•발표: 감정기(경남대 교수)•토론: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둘째날: 3월 9일 수요일 [여성]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빈곤현황과 과제•사회: 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발표: 석재은(보건사회연구원)•토론: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김안나(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방정치]지방자치단체의 빈곤대책•사회: 정영태(민주노동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인하대 교수)•발표: 심재옥(민주노동당 서울시의원)•토론: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최영선(위례지역복지센터 사무국장) [사회권]<strong>빈곤과</strong> 민주주의•사회: 이덕우(민주노동당 중앙선관위원장, 변호사)•발표: 이재영(민주노동당 정책실장)•토론: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문헌준(노숙자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v -
[정치]1960년대 미국 존슨행정부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주는 현재적 의미•사회: 정영태(민주노동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인하대 교수)•발표: 김덕호(한국기술교육대 교수)•토론: 강명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문국(안산공대 교수) [종합토론]빈곤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제•사회: 주대환(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발표: 노대명(보건사회연구원)•토론: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의원단 수석부대표)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권혁철(자유주의연대 정책위원장,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안병룡(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vi -
일정표 - vii -
가나 17대 총선 결과를 두고 우리 사회가 '좌선회'를 했다는 진단이 대부분이다. '민주개혁'을 자처하는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기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43년만에 의회에 진출했으니 그런 평가가나올만하다. 그리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좌향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좌선회'한 총선 결과와 이를 통해 형성된 정치구도, 그리고대중들의 전반적인 의식의 '좌선회'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여내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흔히 '왼쪽'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거나,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세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분배, 평등과 연대, 국가의 역할과책임의 강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이러한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국회에 진보진영의의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크고,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강제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은 대중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일진대, 아직 우리사회에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복지를 삶의 기본권리로 인식하는 이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를 쟁취하기 위한 작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지만, 대중이 큰 흐름을 형성해 본 경험은 부재하다. 또한 우리사회는 '분배'를 둘러싸고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가지고서 커다란대중적 행동이 정치적으로 광범위하게 전개된 적이 없다. ‘왼쪽의 가치’를 가진 대중투쟁의 연장선에서 이루어낸 정치구도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향후 전개될 사회적 재편의 결과는 예측불가능하다. 즉현재의 '좌선회'한 정치구도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진전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 역으로 소위 민주개혁세력이라 불리우는 헤게모니블럭이 형성된 지금 민중의 생활권․노동권과 복지실현을 위한 투쟁이 이제 본격화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할 수 있다.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확보하는 투쟁, '근로빈곤층'이라고 일컬어지듯일하더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안정한 생활의 극복 그리고 무상의료·공공의료를 현실적으로실현하여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투쟁은 지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싸움보다 더 힘든투쟁을 겪어야 할 지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허용 등 시장화를 노골화하고 있는 조건이기도 하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더욱 양산하는 노동시장유연화- 1 -
가 노사관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제되려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목하에 자유화·개방화라는 '세계적 대세'라는 흐름을 뒤에 업고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다 세련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들어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를 공론화하고사회적 의제화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대중들의 직접 참여와 행동을 촉발해내는 프로그램과 계획하에서 사회적․대중적 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더욱 절실하다. 민중복지영역에서 시장도 살고, 민중의삶도 개선되는 '상생과 타협의 정치'는 시장으로 기울어진 추를 더욱 기울어지게 할 뿐이다.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연두기자회견에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고 천명했으며, 지난 해 2월 24일에는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참여복지5개년계획’(이하 계획)이 심의․확정되었다. 이것이 과연 생산적 복지가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 복지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계획’에서 참여복지는‘생산적 복지에서 이룩한 진전을 유지․발전시키면서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적극성을 가진다’고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국민의 정부 복지정책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1)이처럼 오늘의 현실이 생산적 복지(제1차 사회보장5개년계획)의 계승․발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경제위기 상황에서 ‘절대적 빈곤’과 ‘실업’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실제로 생산적 복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은 2001년 3.1%, 2002년 3.0%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의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과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조건부 수급자를 감안하였을 경우 오히려 더줄어들었다. 그리고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 의료보험 통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전사업장 확대에도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70~80%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총피용자수 대비 사회보험 적용율이 43.0%~68.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국민의 사회보험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급여수준과 자활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가는 동일하다. 1인당 실질 평균급여수준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들다.자활사업은 소위 몇 백만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차상위계층의 수에 비해 ‘새발의 피’ 수준에 불과한데,더구나 시장노동이 불가능하지만 추정소득으로 탈락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알리바이성 사업으로 불신받고 있다(류정순, 2003: 221). 한편 실업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실업률의 등락을 초월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는 이미 전체 임금노동자의 반을 넘은지 오래이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빈부격차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청년실업율이10%에 달하고, 2001년 이후 3%대에 머무르고 있는 실업율은 비록 지표상으로는 높지 않다 하더라도불안정한 일자리는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와는 달리 전반적인 민중의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져 불안은 한충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약 3명꼴로 ‘생계형 자살’(엄격히 말하면 ‘사회적 타살’)을 한다는 작년 경찰청의 통계는 이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결과적으로 생산적 복지는 사회의 빈곤화를 막아내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되지 못했다. 단지 신자유주의 전략 속에서 노동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고착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생산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로써 기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를 계승하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된 상대빈곤문제,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사회문제, 소득상승에 뒤따르는 국민들의 고복지 요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역점을 두겠다는 참여복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 2 -
이는 ‘불안정노동과 상대적 빈곤’의 확산에 따른 자본과 권력의 적극적인(?)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볼 수 있다.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실상은 ‘신빈곤’으로 통칭되었다(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2003; 노대명, 2002; 조명래, 1997). 이 개념은 IMF 구제금융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계층하락―‘중산층 몰락’으로 대표되는 상황 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대중성을 갖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을 가지고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과거의 빈곤층과는 다른 점으로 덧붙여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빈곤 개념의 수용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존재여부에서 구해졌고,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결과적현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에서부터 접근하게 되면 이 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또는 IMF 경제위기 때‘갑자기’ 등장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이라는 표적집단에 대한 단기적 처방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먼저 그 원인에 대해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다. 조명래(1997,2003)에 따르면, 우리사회에 신빈곤은 1990년대 초부터 등장하였고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편화되었으며 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전략에서 비롯되는 ‘노동의 위기’이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국가의 위기관리전략은 자활을 강조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정책꾸러미였다(강동진, 2004).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신빈곤에 대한대책이 있었지만 빈곤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는 급격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적 빈곤이나 상대적빈곤의 규모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절대적 빈곤의 경우, 유경준(2003: 26)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을기준으로 한 우리사회의 절대빈곤층은 10.1%,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면 최대 1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이용한 김미곤(2004: 52)은 경상소득 기준 절대빈곤율이 1996년 3.23%에서 2000년 8.75로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상대적 빈곤의경우, 유경준(2003: 28)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이 1996년 12.67%에서 2000년 17.0%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역시 똑같은 자료를 이용한 김미곤(2004: 54)은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1996년에 8.67%에서 2000년 13.56%로 증가하고 있고 지니계수 또한 0.3363에서 0.3969로 높아졌음을밝히고 있다.노대명(2003a: 85)의 연구는 절대적 <strong>빈곤과</strong> 상대적 빈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는2000년 가구소비실태와 2002년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빈곤층 규모를 추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원의 규모를 통해 파악되는 2002년 한국사회 빈곤층의 크기는 273만명(전체인구의 5.8%)에서 523만명(전체인구의 11.1%)로 추정된다. 그리고 좀더 상위에 위치한 집단, 즉 최저생계비 이상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의 규모를 파악해 보면, 이들은240만명(전체인구의 5.1%)에서 249만명(전체인구의 5.3%)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 빈곤층 또는 저소득층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약 140만명(전체인구의 3.0%) 수준이다. 이를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
한국사회의 빈곤층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소득중위소득 60%최저생계비저소득층(약 240~249만명)전인구의 약 3.1~3.3%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수급빈곤층(약 140만명) (약 133~383만명)전인구의 약3.0%전인구의 약 2.8~8.1%재산위와 같은 빈곤의 실상은 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제이기에 앞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방치되고 있음을 뜻한다. 쉽게 말해 이들 빈곤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은 노동시장에서는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내몰리고,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로부터도 배제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의사적이전에 의존하거나 급박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의 노동시장으로다시 뛰어드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그것뿐인가? 왜 사회복지제도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빈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가?신빈곤‘론( 論 )’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가? 신빈곤‘론’은 [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 〓 사회보장제도 적용]이라는 고성장 저실업 시대의 등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대규모 출현이나 상대적 빈곤의 심화라는 현상에 주목할 뿐 1일자리를 갖고 있더라도 소득보장이 되지못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작동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2노동시장으로부터 탈락하였더라도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다. 게다가 신빈곤‘론’은 비정규직과 실업간 경계의순환에서 근로빈곤층의 양산메커니즘을 구하기 때문에 3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층위에서 작동하는 빈곤양산 메커니즘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중산층의 빈곤화와 여성의 빈곤화, 청년실업의 문제를소홀히 다루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빈곤의 실상을 ‘사회적 빈곤’으로 재개념하고자 한다.본고에서 말하는 사회적 빈곤은 삶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strong>양극화</strong>시키는 이윤중심의 시장주의적 사회로 재편하려는 전략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이 사회 전방위에서 일상화되고 보편화되는, 사회화된 빈곤을 말한다. 2) 이제 사회적 빈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2) 빈곤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동어반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발생학적 의미를 따져보면빈곤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전달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사회를 일정한 방향으로 변환시키고자 할 때 필요한 조건을 사회화하는―가령, 임노동의 사회화와 같은, 그런 맥락에서 빈곤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한다.- 4 -
다.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빈곤의 문제는 급격한 사회적 소비 수준의 증가와 이에 따르지 못하는 소득,양자간의 격차를 메워주지 못하는 빈약한 사회적 급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이 배경에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금융자본의 투기적 움직임이 도사리고 있다.전통적인(?) 빈곤층이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최근 늘어나고'신빈곤층'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반복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빈곤에시달리면서도 역설적으로 항상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부를 집중적으로 향유하는 계층이 선도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경향은 이들과 이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의 민중들을 끊임없이 더 빈곤하게 만든다. 이들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각종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신용불량의 늪에 빠져든다. 높은 사교육비와 의료비 지출, 천정부지로 솟는 주택가격은 이들의 자녀들도 빈곤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고 대를 이은 빈곤이 더욱 이들을 절망으로 내몬다.노대명(2003c)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빈곤률―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은 전체인구의 7.94%, 중위소득 40% 기준 빈곤률은 10.81%, 중위소득 50% 기준 빈곤률은 16.12%―을 토대로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아래 과 같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파악한 협의의 근로빈곤층(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은 전체인구의 2.6%(약 123만명), 광의의근로빈곤층(협의의 근로빈곤층이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전체)은 전체인구의 4.89%(약 226만명)로 추정된다. 그리고 OECD 국가들이 사용하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면, 협의의 근로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4.85%(약 224만명), 광의의 빈곤층은 11.19%(약 516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사회의 근로빈곤층 규모 주: 위의 추정치는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빈곤률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를통해 파악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및 중위소득 50%이하 빈곤층 중 근로능력자의 비율을 적용한 것임자료: 노대명(2003: 9) 사회적 빈곤의 실상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근로자가구의 자산감소와 가계빚이다. 문제는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에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 티트머스(Titmuss)가 말한대로 사회복지는 사회의 비복지(diswelfare)에 대한 보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사회 최대의 비복지는 고용불안으로부터 파생되는 생계의 문제이다.고용안정은 소득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그것은 다시 안정적인 가계운영을 위한 조건이 된다.하지만 산업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들, 산업재해, 질병, 출산과 보육, 실업, 노령은소득의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중단 또는 위험을 해결하는데 드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켜 이러한일련의 안정성 연쇄(stability chain)를 해친다. 이렇게 불안정노동은 개인은 물론 가계의 소득안정화- 7 -
를 해치고 그런 상태의 반복이나 지속은 사회적 살인(엥겔스, 1988: 59)으로 치달을 것이다. 살림살이 측면에서 복지국가는 이러한 연쇄를 사회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인 가계소득 유지로실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회보장제도가 단지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홍경준, 2003), 제도의 포괄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급여의자격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생계는 유지되어야 한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의 빈곤층이양산되었고 그것에 대비할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생계위협에 처하지않은 것은 그나마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의 사적이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실증연구를 통해서확인되었다(김태완, 2000; 최정균, 2001; 최현수, 2001; 김교성, 2002; 홍경준, 2002). 물론 이러한현상은 전반적인 가계소비 위축과 병행하였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년 이후부터는 가계소비증가율이 총소득증가율을 웃돌고 있다.자료: 한국은행, 보도자료, 2002. 10실질소득 이상의 소비규모는 신용팽창에 의한 것이다. 3) 더구나 사업소득이나 자본이득(capitalgain)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소득원구성을 감안할 경우(김교성, 2003: 194),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들의 일정한 소비지출 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1내핍생활, 2사적․공적이전으로 소득보충, 3가계빚을 얻는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없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해 보자. 우선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제외하고, 첫 번째는 가계의 총수입에서 생필품에 대한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지출을 억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계의 총수입에서 의식주(생필품)를 위한 지출과 그 나머지 소비항목의 크기를 평균 근로자가구의 경우와 소득하위20%에 해당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를 비교하여 알아보았다. 4) 그 결과 아래 과같이 평균 근로자가구와 소득하위20% 근로자가구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위20% 근로자가구3)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이용 확대와 저금리 영향 등으로 가계의 차입소비성향이 높아진 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과 특소세 인하의 영향으로 내구소비재 지출이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보도자료, 2002. 10)4) 「도시가계조사」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 자영업가구를 제외한 도시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가구란 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를 말한다.- 8 -
는 의식주에 드는 지출과 의식주외에 드는 지출이 총수입의 변화를 대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반면평균 근로자가구는 ‘98년에 총수입이 줄어든 시기를 제외하고 총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식주외 지출은 ’98년 이후 오히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총수입 증가와 내핍생활의 징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적어도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상위소득층의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주: 의식주 지출은 소비지출항목 중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구입비를 합산한 것임.; 단, 주거비는 주택을 다른 가구에게 임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와 같은 기회비용개념이며, 광열․수도비와 같은 주택관리비는 제외하였음.이를 위해 중간소득계층의 변화를 보다 더 보여줄 수 있도록 OECD 방식으로 5) 소득계층을 소득의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하여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저소득층, 50% 이상 100% 미만을 서민계층,100% 이상 150% 미만을 중산계층, 150% 이상을 고소득계층의 4계층으로 재분류한다. 6) 그리고 아래 표와 같이 소득액에 자산감소분과 부채증가분 그리고 가계지출을 반영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초과한 순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이어서 이들 적자가구의 총수입항목 구성비의 변화를 살펴보면 앞에서 나타난 총수입 증가와 내핍 징후의 모순적인 현상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아래 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근로소득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재산소득과자산감소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사업․부업소득과 부채는 고소득계층으로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소비지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은 신용을 매개로 한 가계대출보다는 과거의 저축분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더 많이 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고소득계층은 신용을 매개로 하는 가계대출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자산감소―저축찾은 금액, 보험탄 금액,계탄 금액, 유가증권․부동산․기타재산 매각금액, 빌려준 돈 받음, 기타―와 부채증가―주택융자, 기타융자, 월부,기타―로 구성된 기타수입은 제외된 금액이다. 총수입은 소득에 이것을 합친 금액이다.6) 엄밀히 따지면 OECD 방식과 차이는 있지만 그 취지는 같다. OECD 방식은 중간값의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50% 이하를 빈곤층(low income class)로 하고 기존의 중산층에서 70~150% 계층을중간층(middle income class), 50~70% 계층을 중하층(modest income class)으로 분류하여 중산층의 변화를 보다 잘 볼 수 있게 한다(Atkinson et al., 1995).- 9 -
적자가구(도시근로자가구)의 총수입항목 구성비의 증감 추이(단위: %)근로소득사업․부업소득재산소득 부채 자산감소고소득계층2001 37.4 1.8 1.0 8.8 44.82002 35.0 1.9 1.1 10.4 42.7중산계층2001 41.6 2.4 0.8 8.9 42.92002 36.9 1.9 1.1 9.4 42.7서민계층2001 44.6 1.8 0.5 8.3 37.42002 41.2 1.5 0.5 8.3 38.3저소득층2001 43.3 1.4 0.3 7.7 31.92002 39.1 1.1 0.4 6.3 35.3주 : 적자가구는 가계수지(=소득+자산감소-부채증가-가계지출)가 음(-)인 가구를 말함.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원자료; 홍석표 외(2003: 78)에서 재구성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는 총수입, 즉 자산감소와 부채를 통해 유지되는 가계경제는 결국 ‘처분할 재산이나 저축’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빚쟁이를 양산할 것이다. 7) 이들이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단전단수 또는 임대료 연체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이다(류정순, 2004: 52). 2003년 현재 GNP의 75%에 육박하고 가계당 3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계빚에 대해 정부 또한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한국은행, 2004). 하지만 국민연금을비롯한 연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그 기반마련을 위해 보험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을 팽창시키려는 입법은 오히려 ‘주식시장 부양’이나 ‘증시대책’ 담론으로 ‘빈곤으로 가는 길’을은폐하고 있다. 이미 빈곤이라는 현상은 개인의 게으름이나 노동의 수요공급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 내에서 오히려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빈곤 발생이 자본주의 사회의 본래모습이라고 할 때, 부지런해지거나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잠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특히, IMF이후 한국사회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신빈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노동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경우, 일자리는 있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신빈곤은 개인의 부지런함이나 일시적인 수요공급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은과거에 비해 대량화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변화, 국가의 정책적 자율성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구조의 변동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1945년 이후 한 시대를 풍미한 복지국가는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1인의 남성정규직 가장의 임금으로 한 가족의 생존이 유지되고, 가장의 사회복지 가입으로 가족 모두가 건강이나 노후생활을 보장받는 체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 속에서 등장하7) 개인사업자금대출을 제외한 가계에 대한 일반대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주택자금대출을 의미하는 가계대출규모는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단위: 10억원,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규모 211,166 165,825 191,941 241,068 303,519 391,119 420,938증가율 - -27.3 13.6 20.4 20.6 22.4 7.1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동향」. 통계청 DB- 10 -
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구조변동, 노동시장구조를변화시켰다. 산업구조는 점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노동시장은 유연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유연화 속에서 남성정규직 가장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1인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체계가붕괴되어가는 실정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비록, 유럽의 복지국가시기를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한국 역시 1인의 가장의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는 가족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IMF를 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의 고용이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2003년 8월 실시된 경제활동부가조사에 의하면, 8) 임금노동자 중에서 가구주의 절반정도인 46.5%가 비정규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 가구주 가족의 경우 4.6%만이 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중에서 고용계약이 반복되지 않는 비율은 비정규노동자의13.4%이며, 비정규노동자의 22.9%는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 역시 불안정함을 알 수 있다.노동유연화를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비용감소라는 측면에서 가구주의 고용불안정성은 소득감소로 연결된다. 정규직 가구주의 평균임금이 227만원인 반면, 비정규노동자의 3개월 평균임금이 122만원에 그치고 있어 대략 가구주의 소득이 고용형태에 따라 10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 중 가구주의 고용과 임금분포(단위 : %)남성정규 여성정규 남성비정규 여성비정규1-49 .0 1.3 10.740-99 1.4 6.1 9.6 36.5100-149 6.9 7.5 12.9 19.5150-199 14.8 5.4 10.5 4.9200-249 12.4 3.0 3.7 1.5250-299 9.0 2.1 1.1 .2300이상 14.8 2.0 1.7 .7주 :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2003. 8).이런 남성가구주의 소득상실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가족 구성원 중노동능력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참여이며, 노동시장참여가 급속하게 증가한 집단이 바로 여성이다.여성들의 노동시장참여 자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여성이 과연 어떤 일에 종사하느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착취 속에서 여성의 고용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느냐,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뿐만아니라 빈곤의 확대재생산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현재 한국의 여성들은 노동시장유연화의 매서운 바람을 몸소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70%정도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은70%보다 높은 73%가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들의 고용이 불안정함을 알수 있으며, 기혼여성들은 미혼여성에 비해 고용불안정성에 더욱 노출되어 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도8) 200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부가조사에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인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며 호출,파트, 특수, 용역, 가내근로에 하나라도 응답한 사람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간주한다.- 11 -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경향이 임신과 육아로 인해 M자형을 그린다고 하는데,한국의 정규직은 M자형을 그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규직 여성의 고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반면, 비정규여성은 M자형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이후 남성가구주의 소득하락에 따라 주로 비정규노동에 종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성별 비중(단위 : 천명, %)남성비정규직 비정규전체의 비중 성별비중남성 기혼 2251 29 61(기혼남성 100%)미혼 1512 19 40(미혼남성 100%)총계 3763 48.0 45.4(총남성 100%)여성 기혼 2340 30 73(기혼여성 100%)미혼 1738 22 25(미혼여성 100%)총계 4079 52.0 69.5(총여성 100%)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2003.8) 정규직여성과 여성비정규여성의 연령별 분포---- : 비정규직여성 정규직여성121086420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4 75세 이상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2003.8)또한 앞서 보았듯이 고용불안정성은 임금하락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성의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인금은 100만원이 안되는 82만원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월 82만원으로 여성 혼자 가구를 꾸린다는 것은불가능한 일이며, 아동을 민간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비용정도만을 부담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다.게다가 여성 비정규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노동자들 내부에도 남녀간 소득불평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도의 소득수준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경제적 독립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노동시장외부에서 노동시장유연화의 칼바람을 맞으며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12 -
남녀 고용형태별 평균임금정규직평균임금남성정규직 222남성비정규직 125여성정규직 148여성비정규직 82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 원자료(2003.8)(단위 : 만원)빈곤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사회적 장치가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할 때, 비정규 노동자, 비정규여성은 이런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표에 따르면, 정규직 내에서도여성은 남성에 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비정규직에 비해서도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성비정규노동자들은 노령이나 실업 등의 사회적위험에서 배제되어 있어 사회적 위험이 닥쳐올 경우 사적인 자원망을 동원하지 않는 한 빈곤의 나락에 빠질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고용형태별 보험과 기업복지 적용율(단위: 천명, %)정규직 비정규직성별 정규직내 비율 성별내 비율 성별 비정규내 비율 성별내 비율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국민연금 4382 1710 96.9 95.7 52.9 29.2 1134 937 30.1 23.0 13.7 16.0건강보험 4428 1729 98.0 96.8 53.5 29.5 1255 1011 33.4 24.8 15.2 17.2고용보험 3618 1395 80.0 78.1 43.7 23.8 1109 926 29.5 22.7 13.4 15.8퇴직금 4474 1756 99.0 98.3 54.0 29.9 728 523 19.3 12.8 8.8 8.9상여금 4408 1718 97.5 96.1 53.2 29.3 702 429 18.7 10.5 8.5 7.3시간외수당 3513 1321 77.7 73.9 42.4 22.5 475 376 12.6 9.2 5.7 6.4 따라서 노동시장유연화에 따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60%는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은 신빈곤의 주력부대를 형성한다. 특히, 가구주의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득감소는여성의 노동시장으로 참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대부분 낮은임금,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정규노동에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성을 불안정하고 괴로운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이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유연화는 가구주와 기혼여성의 소득을 합해도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나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자녀가족의 경우 기초적인 생활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빈곤의 여성화란 소득과 소비로 측정되는 경제적 측면뿐만아니라 가족과 시장에서 작용하는 사회심리적 취약성과 기회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 등 총체적인 삶의모습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박영란, 2004: 66)- 13 -
사회적 빈곤의 또 다른 실상은 빈곤대책 그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곤은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기구의 ‘빈곤 관리’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문제는 그 동기와 의도이다.우리사회에서 빈곤대책의 확대는 매번 근로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에직면하곤 하였다(조선일보, 2001.1.28; 윤건영, 2000; 안종범,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앞두고 이견이 존재했는데, 그 동안 입법운동을 주도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최종법안이 애초에 그들이 요구하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행-후개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재정경제부를 위시한 경제논리에 밀려오히려 시행 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김종건, 2000).이러한 복지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경합은 둘간에 독특한 메커니즘을 형성해 왔다. 이것은영국 빈민법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자에 대한 처우는 급여를 받지 않고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자의 사회적 조건과 처우보다 열등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노동능력자를 일하게 하고 수급자 억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박광준, 2002: 137에서 재인용). 이러한 원칙의 제도적 실현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는 절대빈곤선(최저생계비)과 최저임금 사이의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둘사이의 간격이 늘어날수록 노동능력자를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효과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억제하는효과가 크다.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과 같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이런 상황은 임금이 노동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의미보다는이윤창출을 위한 노동자의 상품성만 강조되는 자본의 의도에서 더욱 강화된다. 또한 비정규노동자가노동시장에서 50% 이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함께 생활임금으로서의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오로지 최저임금 ‘준수’만 강조하는 정부는 월( 月 ) 단위의 최저임금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시간당’ 최저임금(시급) 준수로 대체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장 눈여겨 볼 사실은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가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기 시작한1999년부터 올해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까지 포함하여 이 둘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한눈에 알수 있듯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으며, 올해의 격차크기는 1999년 격차크기의 5.8배에 달하고 있다.- 14 -
주: 1) 최저임금은 당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월 기준)임.2)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임.이로써 우리사회는 근로의욕 감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진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를 불안정한 고용으로 내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훈육하여 삶의 의지마저 꺾고 있다. 그들에게 빈곤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유연화는 급격한 실업의 양산과 함께 빈곤의 보편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에 국정지표의 수준으로까지 격상되어 발표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은, 이러한 빈곤화에 저항하는 거센 민중들의 요구에 직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빈곤을 관리하여불만의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어정쩡하게 결합시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또한 복지정책을 다루는 수준에서의 차이는 존재하나 그 맥락은 일맥상통하다 하겠다.어찌되었던 생산적 복지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일정하게 복지제도의 틀거리는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여타의 잡다한 제한없이 4대보험의 전국민 확대가 제도적으로 명시되었고, 공공부조에 있어서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로 전환되면서 인구학적 기준이 폐지되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충급여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그렇다면 현실을 돌아보자. 지금 현재 우리네 민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러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미 빈곤을 관리한다는 것은- 15 -
‘관리대상층’을 명확히 한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결국은 관철시켰던 시민운동진영이 이 정도의 제한된 의미나마 실현시킬 수 있을만한 어떠한 물적기반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에 ‘법적인 제도’가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수사적 의미 이상의 것을 담고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빈곤에 대한 관리는 오히려 매우 제한된 소수의 ‘일정부분의 소득’만을보전해 주면서, 실은 더욱 확대되고 여타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가는 빈곤을 더욱양산하면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가장 대표적인 방치되는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 바로 밖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다( 참조). 물론 빈곤규모를 추계하는데 있어서도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370만 명에서 800만명까지몹시 다양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추계 또한 일괄적으로 내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빈곤인구 중 약 140만 명의 운좋게 수급권자로 선정된 사람들―물론 수급권자의 수급액이나 보장수준 또한 몹시 제한적이긴 하지만―외에는 누구도 고용 및 복지제도의 혜택을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복지혜택이 절실한 이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려하면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노동의지가 없는 게으른 사람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방치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방치되는 빈곤층 규모(2000년)소득최저생계비의 120%최저생계비잠재적 빈곤층전인구의 약4.2%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인구의 약3.2%기초보장 비수급자전인구의 약4.8%재산주 : 음영부분이 차상위계층.자료: 통계청, 「2000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 김미곤․김태완(2004: 57)을 재구성.한술 더 떠서 이처럼 제한된 제도를 구비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방식조차도 아닌, 이전에 비해 많이 다듬어진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아예 복지제도의외곽에 존재하면서 빈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노숙자나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노숙자는 이제 하나의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치곤란한’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의 노숙자대책의 기조가 민간단체의 노숙자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아래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주노동자 또한 2002년 기준으로 40만 명이 넘어서서이제 엄연하게 우리나라 노동력 구성의 분명한 일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벗어나있다. 특히 전체 이주노동자 중 75%를 차지하는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복지혜택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며, 공공부조의 경우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16 -
이주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른 사회보장 적용 여부 이처럼 방치되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몇 제도적 보완으로는 절대로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확대되고 구조화되어가는 빈곤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안전망’ 또는‘체계적인 관리’가 아닌 이러한 구조자체를 파괴할 수 있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들의 실질적인연대가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실업문제에 대해 노사정 수준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을 관철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9) 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를담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에 1인당 월 58~68만원 한도로 9~10개월간 지원한다는 것이다.이를 두고 이견이 분분하다. 그 배경에는 그 동안 시장중심의 고용창출전략은 여전히 소외계층과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고용창출전략은 바람직한탈빈곤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연대한 제3섹터형 고용창출전략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 정책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그 핵심에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즉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놓여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는 대로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아니다. 빈곤의 시급성이나 절박성을 따진다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10개월의 고용을 따질게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빈곤상태와 불안정고용 상태를 반복할 것이 뻔하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또한 사회적 빈곤의 거대한 메커니즘에서빈곤을 양산해 낼 것이다. 결국 겉으로는 ‘사회적’인 무늬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반사회적인’ 정부의‘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적 빈곤9) 그대로 소개하면,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말한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지역에서 민간비영리단체를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취약계층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7 -
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부불가사노동을 사회화시키는 탈가족주의전략과 장애인과 노령자의자립생활과 활동보조를 위한 서비스의 사회화전략과 결합되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전략을 추진하게 되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삶을 회복한 사람들을 광범위한 지지층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원인에 의한 빈곤이든 가구의 빈곤상태로 이어지게되며 그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이 어려워진다. 다음 세대에게 적절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구는 자녀가 다시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후속세대 역시 반복적인 빈곤상태에 빠지게 된다(한국사회보장학회, 2003). 이제 빈곤의 덫(poverty trap)이 현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전승물이 되어가고 있다. 빈곤의 장기화는 물론이고 그 안에서 은폐되고, 반복되고, 확대재생산되고, 관리되고, 방치되는 빈곤은 이제 사회를 파괴하는 기계가 되어 공동체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회적 빈곤을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안정노동과 그것으로 인한 빈곤연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없이 신뢰와 기반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없는 사회협약은 붕괴되기 쉬울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은 일자리수의 양적확대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지 모르지만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동안 힘겹게 쌓아온 노동자계급의 상태를후퇴시키는 새로운 진앙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안전망은 내부자(insider)에게 유리하고, 노동시장으로부터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도 배제되는 불안정노동층은 외부자사회(outsider society)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Esping-Andersen, 1999:304). 이것이 사회적 빈곤이 사회를 파괴하는 기계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이다.현재는 사회적 빈곤이 진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시킬 정치(politics)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평등과 연대를 강화하려는 정책대안과 정치적 지지기반의 결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먼저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안정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재원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자산감소와 가계빚에 의한 은폐되는 빈곤에 대해서는 국가가 장기보증(long-term guarantee)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여성의빈곤화에 대해서는 여성가구주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대책에서 벗어나 예방적이고 여성 생애주기적인접근을 취해 불평등 연쇄로부터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계수조정구도 안에서 결정되는 기초생계비와 최저임금의 간격을 최저임금 상승률에 기초생계비를 연동시키는 연계방식으로 가져감으로써조직된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친복지세력을 형성해나가는 전략을 꾀해야 할 것이다.- 18 -
, 2004, “ ‘’ ”, 『』 20, ,pp.130-150., 2002, “ ”, 『』 48, ,pp.119-149.․, 2004, “ ”, 『 』, 2004 , pp.45-87., 2002, “ ”, 『 』 7, ., 2001, “ ”, 『』 45, , pp.43-54., 2002, “ ”, ꡔ ꡕ 58, ., 2003a, “ ”, 『 』 7, , pp.79-110., 2003b, “ , ”, 『 』 5, , pp.194-217., 2003c, " : ?“, 「 , ?」, 2003 , 2003. 12., 2003, “ ”, 『 』 5, , pp.218-237, 2004, “ : ”, 』 47 2, ., 1999. “ ”, Opinion Leard's Digest, 99-31, No. 64., 2003, 「 」, ․, 2002, 『 』, ., 2000. “ ”, Opinion Leard's Digest, 00-41, No. 124.․․․, 「 10 」, , 2003. 7. 31, 2002, 『 』, , 2004, “ : ‘’ ”, 『』 47 2, ., “ : ‘’ ”, 2001. 1. 28., 1997, “ ”, ꡔ ꡕ 34, , ., 2003, “ ”, 「 , ?」, 2003 , 2003. 12., 2001, 「 」, .F. , ․․ , 1988, 『 』, ., 2003, 「 」(2003. 8 )., 2003, 「 」()., 2002, “ ”, 『』 50, , pp.61-85., 2003, “․․ ”, 『』 54, , pp.321-345. , 『 ․ 』, ., 2004, 「2003 」.Atkinson, Rainwater and Smeeding, 1995, Income Distribution in OECD Countries: Evidence from the Luxembourg Income Study,Paris: OECDEsping-Andersen, 1999, "Politics without Class? Postindustrial Cleavage in Europe and America", Continuity and Change inContemporary Capitalism, edited by Kitschelt, H., Lange, P., Marks, G., Stephens, J. D., Cambridge: CambridgeUniversity Press, pp.293-316.- 19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여는토론:토론1(별첨)토론자 : 유정순(빈곤문제연구소장)- 20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여는토론:토론2(별첨)토론자 : 김미곤(빈곤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1 -
가나 한 사회의 불평등여부를 판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그것은 시대별로 그리고 사회별로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집단별로 또는 개인별로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는 사회 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다.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정확한 통계 결과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한국인 대부분은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문화적 위신에 따라서, 또는 신체적인 특징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경제 현상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현상은 가중되어 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계와 기업의 성장<strong>양극화</strong>’ 보도 자료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원천인 개인소득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훨씬 미달하는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소득에서 개인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하락한 반면 기업부문의 비중은 대폭 상승하고 있다.표 1. (연평균)부문별 성장률 및 분배율 10)1980 1990~962000~042004 (%) 8.7 7.9 5.6 4.7 (%) 10.6 7.0 2.4 2.6 (%) 7.8 6.5 18.9 38.710) 2005. 1. 20 한국은행 보도자료- 22 -
더 구체적으로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 등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임금소득과 기업이익에 이자, 배당, 세금 및 사회부담금 등을 감안한 소득)기준으로 보면, 개인부문과 기업부문의소득증가율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가계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데 비해, 기업소득은 연평균 60%를넘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이러한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의 심화는 일하는 빈곤층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실태에 관한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실업률이 98년 7.0%에서 03년 3.4%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빈곤계층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실업률 안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높아진 것은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즉 일자리와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가 진행되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1)표 2. 빈곤율 추이(‘97~’03)‘97 ‘98 ‘99 ‘00 ‘01 ‘02 ‘03 (%) 3.93 8.16 9.35 7.61 6.50 5.21 6.13동일한 자료에서 빈곤가구의 비목별 지출을 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높게 나타나 생계를 압박하고 있는 데 비해 의료비와 교육비의 경우 일반가구보다 지출비중이 낮아 생계 및 자립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한국개발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고소득층과 최하위 10%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자녀 1인당)이 7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고 하였다 12) . 보고서를 작성한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는 고소득층 자녀는 빈곤층 자녀에 비해 7배 이상 높은 교육비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나중에 고소득을 얻을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이가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교육은 잠재적 능력을 계발하여 그 결과로써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여 개인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하기에 그 접근 기회나 과정에서 구성원 모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개성에 적합한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요인들로 인해 교육 불평등 나아가서는 소외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교육에 있어서 평등이란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학교의 교육조건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과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결과에 관한 단계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때, 교육소외란 신체적, 지역적,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절대적으로 적절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 하기에 이는 무엇보다 사회정의의 차워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교육불평등이란 역시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거나 과정에서 차등적인 여건에 처해 있음으로써 결과로서 열등한 교육성과가 나타나게 되어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되는 상태로 규정할수 있다.이러한 교육소외 및 교육불평등은 개인 삶의 건강성과 발전성을 손상시키고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경제적 성취를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저해함으로써 인적자원개발 및 사회통합 기능을 약화시켜 궁11)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실태(2004. 11. 10 관계부처합동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회의자료)12) 2004. 한국개발연구원(KDI), ’빈곤의 정의와 규모’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 23 -
극적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의 저하를 초래한다.한국 사회에서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을 말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경제적 차이에의한 교육비 지출 정도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교육에 접근하는 기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한국의 교육을 지배하는 것은 학력에 의한 서열 이데올로기이다.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초중등 교육과정을 왜곡하는 대학입시, 객관적 공정성이라는 이유의 국가단위 시험, 그리고 최대한 학생들간의 서열을 구분하려는 학교내 평가는 교육목표의 도달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학력이라는 오직한 가지 기준에 의해 서열화되고 있다.그러나 이 학력이 학습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의 발현이 아니라는 데에 모순이 있다. 학력은 개인의 능력이나 공교육기관의 활동보다는 거주 지역, 경제력,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 등의 사회적 요인이나 가정적 배경 변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입시제도, 교육과정, 학제와 같은 교육 제도적 요인에 의해 구조적으로 유지 강화되고 있다.하기에 교육불평등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교육적인 대책과 사회적인 대책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적으로는 교육소외의 극복, 교육여건의 균질화 등과 함께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는 일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능력과가능성을 수자로 숫자로 표시된 성적으로 환원시켜버리는 학력지상주의 이데올리기를 분쇄해야 한다.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극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탈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해소되어야 한다. 교육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사회를 민주적이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하기에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무상의무교육제도를 확대하여 교육의 기회와 교육여건에서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 대부분 사회의 모습이다.이런 점에 비춰 볼 때 우리 교육은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보다교육으로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2004년 11월 23일 통계청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에 관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는 전국 약 33,000 표본 가구내 상주하는 만15세 이상 가구원 약 70,000명을 대상으로2004. 6. 20.~6. 29.(10일)간 조사하여 집계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고․대학생(재수생, 휴학생포함)의 98.8%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고 있다.같은 조사에서 재학생이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47.3%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소질개발」25.7%, 「학력을 차별하는 분위기 때문」20.1%, 「인격이나 교양을 쌓기 위해」4.0% 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6.6%p,「학력을 차별하는 분위기 때문」은 4.2%p 증가한 반면 「자신의 소질개발」은 9.7%p 감소한것이다.- 24 -
표 3. 학생이 기대하는 교육 목적 13) 2000 100.0 40.7 35.4 2.9 15.9 4.5 0.62004 100.0 47.3 25.7 2.6 20.1 4.0 0.3 100.0 48.8 23.4 3.1 20.7 3.6 0.4 100.0 45.4 28.4 2.1 19.3 4.5 0.2이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교육은 사회적 가치를 전승하거나, 학문의 진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공공성을상실한 채 사적인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공교육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밝혀 낼 수 있다.개항이후 불과 100여년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근대는자생적 발전 과정을 봉쇄당한 채 일제 식민지 지배 질서로부터 시작되었다. 봉건 조선의 지배 계층은일제의 하위 파트너로 편입되어 경제적 지배력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식민지 지배 기간동안 지배의정당성을 대부분 상실했다. 해방 직후의 계급투쟁, 특히 한국전쟁과 농지개혁은 구래의 지주계급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봉건적 신분 질서를 실질적으로 붕괴시켰다. 이로써 한국사회는 비록 서구와같은 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봉건적 신분제 폐지라는 근대적 과제를 어느 사회보다 철저히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평등주의가 자리잡았다 14) .서양에서 근대화란 개인이 봉건적 질서로부터 벗어나 자립적인 주체로서 정립하는 과정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국의 이상을 근대적 국가형태 속에서 새로이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한국은 개인의 이념도 공화국의 이념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식민통치의 역사 그리고 군부독재가 주도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개인은 철저하게 국가를 가장한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봉쇄되어버렸다. 그러한 권력의 의해 장악된 국가는 공화국의 이념이 서지 못했기에 사회보장도 사회복지도자리잡지 못했다. 이런 역사적 체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국가의 보편적 이익을 냉소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가족적 이익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런 귀결이다.이 과정에서 신분을 대체한 새로운 질서는 경제와 교육이었다. 다시 말해, 돈 많이 가진 자가 교육을 통해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새로운 질서가 되고 만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교육은 공공성을상실한 채 사적인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고 만다.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확대되어 가는 교육기회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우골탑이라는 신분상승의 욕망의 발현이다.식민치하에서 교육기회는 식민지배 엘리트 양성통로였으며, 해방이후에도 좁은 대학문은 그 기회를가진 자에게는 부와 권력이라는 부산물을 언제나 남겨 주었다. 비록 문은 좁았지만, 그 문이 신분이나여타 이유로 닫혀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국민들은 계층상승의 통로가 된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기회를얻고자 몸부림쳤다. 하기에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희생을 들여서라도 얻고자 하였다.13) 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14) 정진상, 해방직후 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994- 25 -
이러한 계층 상승의 욕망과, 공공성의 상실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하여 1980년대쯤 들어서는 이미 고등교육이 대중교육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04년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어서고 있다.그러나 이런 교육기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은 여전히 우리사회 교육문제의 핵심원인이다.이는 대학의 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만큼 졸업장의 사회적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대학의 졸업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에 의해 질서가만들어졌다.따라서 대학졸업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보장해주는 것은 단순한 대졸학력이 아니라 위계서열 내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학인가,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이 아닌서울 소재의 대학인가, 비명문대가 아닌 명문대를 졸업했는가의 여부가 된다.실제로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명문대 졸업생들은보다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명문대 졸업생들에 비해서 선후배의 연줄망을 통해서 다양한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하기에 모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들여 학벌을 취득하고 나면, 그 학벌이 다시 자본이 되고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벌은 모든 종류의 권력을 불평등하게 배치하는 기제인 동시에 경제적 불평등을 결정하는 배치기제이기도 한 것이다.원칙적으로 말해 한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의 독점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권력(power)과 재산(property)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자본이라 할 수있는 위세(privilege)까지 결합될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적 권력은 언제나 경제적 능력, 즉 부와 결합한다. 권력은 언제나 집단적으로 행사되기에, 한 권력집단을 같은 이해관계를가진 동질적 집단으로 묶어주는 첫째가는 끈이 바로 경제적 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권력은 이익을 통해 유지된다. 재산과 자본의 소유 역시 법적 강제 및 정치적 권력과 동떨어져 홀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권력이 자본에 의존하듯, 자본은 거꾸로 권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15) .한국사회는 학벌사회이다. 우리사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벌주의로 인해 사회․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에시달리고 있다. 학벌주의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전 영역에 부당한 패거리를 조직하고 세칭 연줄과 빽이라는 단어를 횡행하게 한다. 학벌은 전근대적인 신분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학벌이 사회 권력과 연관되어 부와 권력을 독점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현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출신 대학별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흥미 있는 결과가 보인다. 모든 직급에서 서울대의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니다. 하위직이나 중간 직급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의 최상층부에 올라갈수록 서울대의 점유율은 높아져 간다. 비단 정치권만이 아니다. 법조계나 언론이나 경제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권력의 최상층부는 서울대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16) .하기에 학벌은 은연중에 모든 이들의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능력이나 인격 이전에 그가 가진 학벌로 모두를 판단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는 고용이나 인사 과정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심지어는 혼인이나 교우 등 사적인 관계에서도 판단의 준거가 되고 있어서, 학벌을 획득하기 위한 경15) 김상봉. 2004. 한길사. 학벌사회 84쪽16) 서울대 학벌이 각 분야에서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통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앙부처 국장급 이상 1급 공무원 243명(2001년)의 56.4%, 16대 국회의원 273명의 38.1%, 검사장의 72.5%(2002년), 상장법인 대표이사 896명(2002년)의 22.1%, 6대 신문사 편집국장의69%, 대학교수 46,909명의 27.2%(2002년)가 서울대 출신이다. 교육인적자원부, (2003), 61-62쪽.- 26 -
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무엇보다 학벌의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평생을 무기력하게 실패를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이른바 이류․삼류대학에 다니는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이류․삼류 인간이라는 뼈아픈 정체의식에 평생 시달리게 된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대학에 나오지 못한 이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또한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주의로 인해 지방대와 서울대의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서열의 상위권을 서울 지역의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이 대학 출신들이 중앙의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결과 중앙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은 지방의 우수한인재들을 끌어 들여와 인재들마저 독과점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대학은 인적자원 부족으로 쇠퇴를 거듭했으며 이는 지방의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기업은 더욱 경영이 어려워지고, 지방 경제는어려워지며, 독자적인 발전방향의 축을 찾지 못하고 서울 의존적‧서울 종속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학벌사회를 형성하며, 우리나라 교육모순이 응결되어 있는 지점은 ‘대학서열체제’ 17) 이다. 한국사회대학서열체제의 특징은 먼저 대학의 교육력이나 학문과 무관하게 입학생들의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는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은 획일적인 시험에 의해 점수로 서열화되고 있으며, 이 점수에 의해 각 대학과 학문이 또한 서열화되고 있다.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연고대, 수도권대,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전문대 순으로수능점수에 의해 대학별․학과별 서열이 형성되어 있다 18) . 매년 전국단위의 서열화 시험이 치러지고 나면, 입시전문산업체에서는 수능점수에 따른 배치표를 발표하고, 수험생들은 그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서열을 잘못 판정한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실수가 그대로 현실로 규정되기 때문이다.학벌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인 상황에서 학부모와 청소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으로인정받는 학벌 추구에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은 최대한의 사교육비를 투자하며 이 과정에서심지어는 해체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는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학벌이 계승되는 현상을불러와 <strong>빈곤과</strong> 차별이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는다. 하기에 대학교육의 기회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 대학진학을 위한 경쟁은 폭주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모르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17) 정진상은 2004. 8. 10일 열린 ‘주요국의 대학체제와 한국대학의 개혁방안 토론회’의 발제문인 ‘서울대 폐지론의 실제 -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에서 대학서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대학서열이란 여러 대학들 간의 자연적인 차이를 기술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대학서열화’라고 할 때에는의미가 달라진다. 이것은 대학서열이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굳어져 가는 양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학벌문제와 입시경쟁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논자들은 대학 서열 대신 대학서열화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 서열이 대학서열화를 통해 이미 고착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표현하기 위해 ‘대학서열체계’라는 개념이 쓰이기 시작했다. 1) 그런데 시스템(system)을 체계 혹은 체제로 번역하는데 ‘체계’라는 말은 사물의 형식과 내용 중 형식을 강조하는 반면, ‘체제’라는 말은 내용을 강조하는 어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들이 서열화 과정을 통해 고착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의 대학전체의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대학서열체제’라고 부른다.18) 김안나. 2004. 교육사회학연구제 13권 3호. . 신입생들의 수학능력 시험 점수로 볼 때, 우리나라대학들은 서울의 국립대학을 정점을 하여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설립 역사가 오래된 대학과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 신설된 대학 등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는 위계구조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의 사립대학, 특히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된 이후에 신설된 지방의 사립대학들이 서열화 구조의 가장 낮은 층을 구성하고있다.19) 2003. 3. 1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현황통계에 의하면 2년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수는 396개교에 입학 정원- 27 -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어 사회귀족이 될 수 있는 직업으로 나가는 소수 학과 진학을 두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학교에서는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을 말하지 않는다. 오직 경쟁에서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독식하는 살육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주도형 산업화를 통해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생활영역에서의 신분집단 형성과 지역간불균등 성장으로 인해 거주 지역이 새로이 신분적인 속성을 지니기 시작했다. 지속적인 산업화로 계급구조화가 진행되면서, 계급에 따라서 소비생활, 여가생활, 문화생활, 거주 지역 등에 점점 분화되는양상을 보이고 있다 20) .이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게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거주 지역에 따른 <strong>양극화</strong>로 나타난다.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의 <strong>양극화</strong>, 도시내에서 거주 지역에 따른 집단적인 <strong>양극화</strong>, 동일 거주지역내에서 소득에 따른 <strong>양극화</strong>가 심화되고 있다. 2004년 대입제도변경과 관련하여 학교의 소재지와 명성에따라 구성원전체에 집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 고교등급제 파동에서 그 구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다음으로 1989년을 전후로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함에 따라 냉전체제는 해체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하는 경제적 차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자본과 노동자의 이동을 가져오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와 세계무역기구체제의 등장으로 한국시장이 외국 기업에 개방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부의 배분과 잉여의 수취가 국내의 계급적 관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결정이나 전지국적 경제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교육마저 시장화 상품화되는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학생의 이동을 넘어서 교육과정의 전파, 나아가 학력이수증의 교류는 교육기회의 차별과 불평등을심화시키고, 교육기회에 따른 <strong>양극화</strong>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개방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화 조치로 인해 그 왜곡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잉여금의 해외 송출 등의 독소 조항을 담고 있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그것이 가시화될 경우 우리 공교육 전반의 지형을 뒤흔들것이다. 불완전하게 지탱되고 있는 후기 중등교육의 보편체계가 무너지고 대학에 이어 후기 중등마저서열체제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전지구화로 인해 나타나는 상대적인 측면은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면서, 한국 노동계급의 구성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노동자들이기피하는 업종에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미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이제 이들 자녀들의 교육문제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투자할 자본에게는외국교육기관특별법까지 마련해가며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명분이 있다면, 생산 노동에게는 이보다 더은 665,743명이다. 이에 반해 고등학교 졸업자수는 일반계 실업계를 합하여 441,633명에 불과하다. 2005학년도 대입전형시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정원은 642,256명이며, 고교 졸업예정자는 581,136명이다.20)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38. 을유문화사.- 28 -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기회는 제공되어야 한다.근대 제도교육의 형성과정에서 교육의 양적 기회는 확대되었을지언정 그에 반해 사회 불평등을 확대재생산 해왔다. 이를 위해 기회는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회를 차등화함으로써 평등한 접근의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제가 바로 학업 성취도로 측정되는 학력이라는 준거이다. 한국사회는 이를 직업구조와 연동시킴으로써 불평등이 개인의 학력차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으면 고위직에 오르고 고임금을 받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 학력의 신화다.게다가 교육과정에 따른 급별 연령별 교육목표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교육적으로 유용한 학력차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정의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의 입시체제에서 학력은 본질적인 의미의 학력이 아니라 서열화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학력으로, 배우고 시험 치르고 돌아서면잊어버리는 학력이다. 또한 학력이 학문과 지적 발전이 아니라 서열화를 위한 변별 도구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하기에 정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격차를 드러내기 보다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노력을 하는 것이 분권과 통합의 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과 수월성교육 수준별교육 등다양한 이유를 들어 제도 교육 내에 불평등이 자행되고 있다.학력이라는 유일한 잣대에 의해 서열화되고, 미래가 배정되는 교육현실에서 빈곤계층의 교육 소외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빈곤 계층은 일반적으로 중층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다. 소득이 없고,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의 교육기능이 취약하고,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하기에 장애를 가질 확률이높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이런 어려움은 그들의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빈곤계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가족으로부터 본받을만한 미래의 표상을 가지기 어렵고, 부모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속감을 가지기 어렵다. 당연히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미래에 대한 긍정심이나 지신감 자기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기 어렵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멀어질 수밖에없다. 심하게는 적절한 신체적인 성장에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으로 인한 불평등한국사회는 전체 공교육비 중 사부담 비율이 높으며,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다.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 대비(GDP) 구가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률은 OECD국가의 2배, 고등교육은 4배이상 높다.- 29 -
표 4.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4 93.0 7.0 34.0 66.0 91.5 8.5 43.1 56.9 99.9 0.1 87.7 12.3 93.0 7.0 85.6 14.4OECD 92.4 7.6 78.2 21.8 76.2 23.8 15.9 84.1이는 교육의 사사화를 조장하여 부실한 공교육을 학습자 개인과 그 가족의 비용에 의해 충당하고있다. 사교육비의 규모와 과외를 받는 학생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01년의 경우 10.7조원이던 사교육비는 ’03년에는 13.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과외를 받는 학생은 ’00년에 58.2%에서 ’03년에는 72.6%로 증가하였다.당연히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혜택 차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학벌주의 풍토 속에서 계층의대물림을 야기하고 있다.도시의 지역간 격차산업화가 전개되고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라 대도시의 특정지역에 직업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 밀집 지역 형성되었다. 이들 지역의 학생은 경제적 <strong>빈곤과</strong> 이로 인한 학부모의 보호및 지원 부족으로 학습 준비도와 학습 의욕 저하 및 성적 부진의 악순환 현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서울시 교육청(2002. 11)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일부 저소득 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은 3.6%에서 4.5% 사이이며, 이는 전국 평균 비율 1.1%의 3.5배에서 4.5배에 해당한다고 한다.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제도가 2001년 도입된 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성한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는 45억에서 시작, 2002년 152억, 2003년 17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해 오고 있다. 2003년의 경우를 보면 강남구 47억, 중구 27억, 양천구 11억, 노원구 10억, 마포구 10억 등으로 10억 원 이상을편성한 자치구가 있는 반면 성북구는 1억5천, 금천구는 5천2백만 원 등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은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격차 의식을 심화시켜 지역주민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21) .농어촌 교육여건 악화농어촌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농어촌 학생수가 1999년 145만명에서 2003년 124만명으로 5년간14.5% 감소하였으며, 소규모 학교가 농어촌 전체 5,194교 중 2,246교로 43.2%를 차지하고 있다.농어촌의 작은 학교는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학력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지금의 경쟁체제에서 대도시의 교육여건과 도저히 견줄 수가 없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여복식수업, 비전공자 수업 등으로 수업부실 및 학력저하를 초래하며, 특별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의 원21) 2004. 12. 15. 이인영.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서의 교육복지. 교육복지 정책포럼 자료집3. 8쪽- 30 -
활한 운영이 어렵다. 최소한의 상치과목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으며, 학교 밖 교육기관의 존재 또한부실하기 그지없다.하기에, 농어촌지역 학생이 도시지역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저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통학 거리나 문화적인 환경까지 고려하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이주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특수교육의 경우2004년 10월에 발표한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9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 아동 9만 5천여명중에서 5만 1천여명만이 특수교육 수혜를 받고 있다. 이중 3만여명은 일반학급에 재학중이며, 1만 3천여명은 취학을 유예하고 가정․시설․병원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34.5%, 중학교 18.35, 고등학교 9.6%, 고등교육기관에는 0.9%만이 취학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5. 장애인 취학률 22) (단위 : %) 41.9 98.5 98.5 94.0 87.0 6.6 34.5 18.3 9.6 0.9주 : 1) 취학률 = (학생수 / 취학 적령인구) ×1002)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및 대학교가 포함됨.3) 유치원 취원률은 4, 5세 기준임.4) 비장애인 취학률은 2002년, 장애인의 취학률은 2001년 기준임.5) 취학적령인구는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를 참조함.만성질환으로 인한 휴학 또는 중퇴 아동이 연 8,000여명으로 대부분 장기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받기위해 학업 포기 상태에 있다.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열려 있지 않다. 2003학년도 기준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대학은 전국 350개 대학 중 64개교로서 총 18.3%에 불과하다. 특히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 46개교 중 7개교만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체제가 부족하다. 2003년 8월~12월 「전국 대학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결과 대규모 대학의 63.1%, 중규모 대학의 85.9%, 소규모 대학의 80.7%가 개선 요망 대학에 해당한다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4년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다는 사람의 비율은22) 문용린(2002). “한국 국가교육 경쟁력의 현재와 미래”, 오천석 기념 강좌.- 31 -
31.5%로 2000년 24.5%에 비해 7.0%p 증가했다. 그러나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경제적 형편」이 66.5%로 가장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표 6.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단위 : %) , , 2000 100.0 24.5 75.5 63.5 1.2 12.5 13.7 5.9 1.1 2.22004 100.0 31.5 68.5 66.5 1.4 12.6 11.6 5.6 1.1 1.1 100.0 36.0 64.0 71.3 1.1 15.8 2.9 6.3 1.3 1.3 100.0 27.4 72.6 62.7 1.6 10.1 18.6 5.0 0.9 1.02004. 11.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빈곤이 교육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4~5만 명 정도 발생하여 중․고교 전체 학생 360여만명의 1.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중에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조기유학이나 이민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빈곤 등으로 인한 중퇴이다표 7. 2003년도 학업중단 학생수 3,621,170 1,854,641 1,224,452 542,077 54,611(1.5%) 15,987 17,095 21,529 11,249 6,491 4,459 299 43,362(1.2%) 9,496(0.5%) 12,636(1.0%) 21,230(3.9%)교육통계연보(2003)학업중단 또는 학업포기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 약 5만여명의 수업료 미납자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열려 있지 않다. 현재 대학의 입학의 전형과정이나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금 등이 대부분 성적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전체장학금 수혜자의 9%, 장학금 금액의 7%만이 가계 곤란자에 지급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증가에 따라 외국인 자녀의 수 증가하고 있다. 2002년 현재 합법체류외국인 339,767명(54%), 불법체류 외국인 289,239명(46%)으로 총 629,006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한겨레의 보도(2003. 9. 24.)에 의하면 불법 체류 외국인 약 29만 명의 자녀 중 취학 대상으로 추정되는 자녀는 약 1천여 명이나 이중에서 약 800명 이상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23) 이하 인용한 자료는 2004년 10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참여정부교육복지종합계획’에서 인용한 것임- 32 -
추정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국내 학교에서 수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아래 표와 같다.표 8. 국내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학생수 (’03. 6월, 단위 : 명) 570(131) 191(6) 76(2) 837(139) ( )는 불법체류 학생수정부에서는 의무교육 단계의 경우 불법체류자도 학구내 거주 증명 서류 제출로 입학이 가능하나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법령과의 충돌 등으로 불법체류자 자녀의 수용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진학한다하더라도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문화적 배려 부족, 한국어 학습 기회 부족으로 집단 따돌림, 학교부적응 및 학습부진 발생하고 있다. 학교 또한 교사의 외국인 학생 지도 어려움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국내 학부모의 거부감으로 외국인 자녀의 수용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는 유학비자가 있어야 하며, 경제 사정으로 자녀를 진학시키기는 어려움이 심하다. IMF체제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제3세계의 <strong>빈곤과</strong> 실업사태를 악화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대량실업, 소득격차의확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및 빈곤의 확산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야기되어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쟁적 시장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켜 빈부의 격차를 증폭시켰다. 또한 중․하류계층에 속하는 실업자들의 수를 증대시키고 소외계층을 양산하여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노숙자의 사회문제화, 걸식아동의 증대, 범죄와 일탈의 증가, 이혼의 증가, 자살, 가족해체 등과같은 사회해체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24) .시장주의자(김영삼 정부 5.31교육개혁 당시 교육부장관) 안병영을 등용할 때, 노무현 정권의 강한신자유주의 교육구조조정 드라이브는 예견되었다. 시장화 방책을 요리조리 끼워 넣어 내놓은 엉터리“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인권유린의 0교시, 보충, 타율학습으로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고 있으며, 국가가 나서서 EBS로 입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더하여, 학벌주의의 근간인 대학서열체제를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으로 서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급기야 ‘대학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국공립대는민영화, 사립대학은 영리법인화 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교육의 시장화 · 상품화 공세는 전면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이를 위해수익창출을 위한 학문재편전략을 정점으로, 학교의 기업화, 교원구조조정, 노동력 유연화가 추진되고있다. 2004년 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특목고 확대방안, 전경련에서 발표한 전문대학 영리법인화 방안, 국무회의를 통과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사이에있었던 사학 설립주체 다양화 논의 등 주무부처인 교육부 외에도 경제관련 부처에서 교육의 시장화 ·상품화 정책이 노골적으로 출몰하고 있다.24) 2002. 홍영란, 교육개발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의 전략과 과제- 33 -
결국 국민들의 참여에 기반한다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입장이 반영될 틈은 없으며, 교육부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교육정책에 대한 집단적 반발을 ‘이해 집단 간의 갈등’으로 깎아내리거나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방식을 사용하고 있다.여기에, 경제부처 · 재계 · KDI · 보수언론 등 사회 기득권층(경제, 학벌 엘리트)이 교육정책 및 담론 영역을 장악하고 휘두르는 현상이 근래에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2년여를 돌아보면, 지자체의부동산 대책으로 학교정책이 입안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논리로 교육이 상품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정부 부처에서는 경제 관료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KDI나 경제부처, 보수언론의 최근2, 3년간의 담론 형태는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교육구조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출발 당시 대중을 현혹시키는 논리로 사용한 ‘소비자 주권’론의 소비자가 결국은 자본이었음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이전까지의 교육시장화 정책이 주로 고등교육(대학교육) 부문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양상은 부동산정책이나 빈곤의 세습화 논쟁 등과 맞물리면서 초․중등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교원양성임용제도와 교원연수와 교원평가제도 개편을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교원구조조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게다가 2005년 마치게 되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시범실시를 교육개방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는보수권력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이외에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나 교육혁신안에서는 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에 통합하고, 지자체에 지방교육재정을 떠넘기려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예고되고 있으며, 교원지방직화 계획도 이미 그 모습이드러나고 있다.한국사회 교육문제는 다른 사회와는 달리 인종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보다는 계층 및 지역간의 격차와 불평등이 근원이다. 이미 확인하였듯이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입시경쟁의 승리를 위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문화자본의 정도에 따라 사교육비와 그에 따른성취정도에 차별이 있다. 2003년도 초에 발표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서울대 입학 비율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3배에 불과하였으나, 15년사이 무려 16.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하기에 교육은 사적인 권력획득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중단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지역․계층의 구분 없이 누구나 보편적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지역에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실업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미흡하며 특히지식기반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심화되는 지식 격차, 정보 격차는 빈곤에서의 탈출을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형식적인 선언 수준이어서 농어촌지역에 1군 1우수교 집중 육성이나, E-learning의 확대 실시 등의 방안제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5) .25) 2004. 10. 교육인적자원부.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 참고- 34 -
2004년 12월 0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03년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2003) 26) ’는 우리나라 고교 1학년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학생들의학력이 세계 최정상급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PISA는 사실상 초․중학교까지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성취도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 PISA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온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까지의 무상의무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며, 현행 무시험 전형제도에도 문제점이없음을 보여주고 있다.오히려, 우리나라 학생의 우수한 성취수준은 그간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하향평준화’ 및 ‘교육경쟁력약화’ 비난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강제보충․자율학습 등 강압적이고 가혹한 학습 환경과 사교육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학생들이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며, 만에 하나라도 경쟁위주 입시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높은 학업성취도가 대학교육의 경쟁력으로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지나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그러나 기득권층은 이런 결과를 의도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지난 2000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전체 학생들의 순위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준화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또한, 이런 현실에도 대학들은 아직도 신입생들이 대학공부를 할 만한 기초학력이 부족하다며 중등교육을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학력 수준이 어느 수준이란 말인가.소득에 의한 학력격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4년 11월 11일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Korean Education &Employment Panel) 27) 결과 보도 자료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으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26)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 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하기 위하여 치르는 평가로, 총 41개국(OECD 국가 30개국 포함)의 약 28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PISA 2003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문제해결력 평균점수는 1위(550점), 읽기영역 평균점수는534점으로 참가국 가운데 핀란드(543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수학은 홍콩, 핀란드에 이어 3위(544점)를,과학은 4위(538점)를 기록했다. 이는 PISA 2000에 비해 읽기는 4계단이나 뛰어올랐으나 수학은 1계단, 과학은 3계단이 떨어진 결과이다. 최상위권(상위 5%)의 점수도 읽기가 2000년 20위에서 지난해 7위로, 수학은 5위에서 3위로, 과학은 5위에서 2위로 각각 올랐고 문제 해결력은 3위를 차지했다.,27)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김장호) 채창균 박사팀은 2004년 4월에서 8월까지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게 표집된 중학교 3학년 학생 2,000명과 실업계 고교 3학년 학생, 일반계 고교 3학년 학생 각각 2,000명 등 도합6,000명과 이들 학생의 학부모, 담임선생, 학교행정가(교감 등)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이들이 노동시장에 나가 만 29세가 될 때까지 10여년 이상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밝혔다.- 35 -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44.1%, 중위권에서는 31.0%, 하위권에서는 26.5%로 나타나, 성적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3.1%p, 하위권보다 17.6%p 3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는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성적과 가구 소득간의 상관관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표 9. 지난 1년간 월평균 가구 소득과 성적(중학교) 같은 자료에 의하면, 당연한 이치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고 있으며,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높다. 중학생의 경우 2003년 9월에서 2004년 2년 사이에 국어 과목에 대해 사교육을 받은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60.6%로, 중위권의 47.6%, 하위권의 35.9%에비해 각각 13.0%p, 24.7%p 높다. 수학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성적상위권에서 80.6%로중위권의 67.0%, 하위권의 49.1%에 비해 각각 13.6%p, 31.5%p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과목의 사교육을 받고 있는 비율은 성적상위권의 경우 80.8%로 중위권 65.0%, 하위권 48.9%에 비해 각각 15.8%p, 31.9%p 높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한 차이가확인되었다.문화자본에 의한 학력격차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같은 자료(2004. 11. 11)에 의하면, 가정내 문화 환경의 차이 역시 자녀의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의 책 보유 권수가 많거나 가족간에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이나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다면, 자녀의 성적도 보다 좋다. 중학생의 경우 책 보유 권수가 300권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24.4%, 중위권에서는 12.5%, 하위권에서는6.8%로, 성적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1.9%p, 하위권보다 17.6%p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간에 영화나 연극, 뮤지컬을 전혀 관람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38.5%, 중위권에서는51.0%, 하위권에서는 58.6%로, 성적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2.5%p, 하위권보다 21.1%p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족간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음악회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이 성적 상위권에서는 51.4%, 중위권에서는 64.6%, 하위권에서는 73.3%로 성적 상위권이 중위권보다 13.2%p, 중위권이하위권보다 21.9%p 낮게 나타났다. 중학생에서 확인되는 문화생활과 성적간의 상관관계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6 -
표 10. 가정의 책 보유 권수(중학교) 이는 대학서열체제에 따른 학벌사회인 한국에서 대학 진학과 직결되고 있다. 수능성적과 문화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각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부모의 문화자본의 보유량은 수능성적의 위계와 일치한다 28) .연구자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계급상승을 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사회계급 구성원들의 주관적인 열망이나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능성은 사회계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이는 학생 개개인의 인지적 능력을 수치로 측정하고 있는 수능성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교육체계가 교묘하게 계급을 재생산해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있다.지역간 학력격차2004년 입시변경안 논쟁이 지속되던 중 한나라당의 이주호 교육상임위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2001년 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지역간 학력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중학교의 학력격차로 이어지고, 고교 평준화 지역 내에도 학력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29) . 이후 기득권층은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거나 지역간 계층간 학력차를 현실화하여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학력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로 의견이 나뉘어 공방이 진행되었다.거주 지역은 생존과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문화, 서비스, 교육 등 총체적인 공간이다. 당연히거주지역의 차이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차이를 반영하며,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 나은 거주지역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하기에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은 심각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거주 지역의 선택과 이동 과정에서 교육환경은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기에 이러한 거주 지역의차이는 교육현상에 관한 의식과 지향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0) . 당연히 거주 지역에 따른 학력 차이28) 장미혜(한국여성개발원).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2004. 11. 10 [프랑스고등교육제도와 한국] 토론회 자료집 124쪽29) 2004. 9월 9일 보도 자료에서 이주호 의원은 학교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입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며, 평준화 고교 간에도 엄연히 학교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년 입시개선 시안은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고교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대학입시에 서 내신반영의 완전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대학이 고교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 학교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0) 변수용, 김경근(2004). 평준화 제도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 결정요인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2호현대 사회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계층에 따른 거주지분화 현상은 교육성취에 대한 거주지의 영향을 매개로 하여, 공간적 불평등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이- 37 -
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강남 학교의 학업성취가 높은 것은 학교의 교육력이 높기보다는 강남이라는 특권층 거주 지역에 우수한 학생이 모임으로써 높은 교육적인 성취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강남은 일정한 경제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거주할 여력이 있으며, 이들은 그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교육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성기선의 연구 31) 에 의하면 강남 8학군이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학생들의 투입요인인 1학년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거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모의 지원, 개인의 노력등에 따른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어떤 인간으로 기를 것이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라는 철학적, 사회적 쟁점이응축된 지점이다. 동시에 교사에게 있어서는 노동과정의 '지침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정책의 ‘핵심중의 핵심’이다.그런데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이 사회에는 이해를 달리하는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기에 후속세대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배우면서 ‘차별의식’이 아닌 ‘연대의 정신’을, ‘자본을 위한 한낱 소모품’으로서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사회생활과 노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며 국가 교육과정 정책은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공교육의 교육과정은 그런 ‘차이’들이 서로 교류, 논의, 소통되는 가운데 어려울지라도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를 찾아내고 그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은 지식과 기술에 대한 권리의 차등화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전면적 발달을 가로막는 교육과정이다.첫째, 학교 지식의 규정과 교육과정 편성에서 노동자, 민중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독재 정권에서 학교교육과정은 정권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조차 공식적교육과정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었다. 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 이후 지금까지도 상황이 근본적으로달라진 건 아니다. 7차 교육과정으로 대별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과정 재편 과정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둘째, 지식, 기술의 분배가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 기술의 생산 과정의 통제권과 결과물을자본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의 자녀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지식의 차등적 분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준별, 선택형이 골간인 7차 교육과정에서 이런 현상은 보다 노골화되고 있다. ‘가르기’를 교육과정의 기본원리로 삼는 순간, 지식의 차등적 분배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는 우려할 만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현대 후기산업사회에서 질 높은 교육에의 접근은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사회 계층에 따른 거주지 분화도 이제는 상당히심각한 국면에 이르러 있다.31) 성기선(2003). 서울시고등학교 학군효과분석연구 -8학군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그는 이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서울시 11개 학군별 학업성취도 분석 결과, 학군에 따라 1학년 입학당시 수준에 차이가 있다.- 1학년 학업성취도 수준을 이러한 차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졸업이전까지 지속된다.- 실제로 1학년 학업성취도 수준을 통제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8학군이 결코 높지 않다.- 하기에 8학군의 성취는 학교나 학군의 효과가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가 고착화된 것이다.- 38 -
현재의 학교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노동의 탈숙련화 경향과도 연관지을 수 있다. 지식을 배타적 소유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윤추구의 기반으로 삼는 순간, 자본에 의한 지식독점이 일어난다. 지식의 생산은 공공의 힘으로 창출되고 축적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에 의해 한 곳에 모이고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순간 다수 민중은 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며 노동과정에 있어서는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심화되는 탈숙련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결국, 지식과 기술에 대한민중의 권리 박탈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있다 32) .마지막으로 교육 내용에 의한 통제이다. 중·고교 학생들은 ‘노동자’는 육체노동자를 지칭하고, ‘근로자’는 사무직 노동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배우고 있다. 이는 노동·노사관계에 대한 편협한 교육이 낳은결과이다. ‘폭력적 파업만을 일삼는 노동자와 그들의 노동조합을 통한 편협된 집단 이기주의’야말로경제악화의 주범이고, 따라서 이러한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야기되는 노사갈등은 배제되어야 하며 표출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교과서는 기술되어 있으며, 이는 평가를 통해 주입된다. 당연히 학생들은이러한 이해·인식에 근거하여 학생들은 당연히 ‘노동자’의 삶보다는 ‘근로자’의 삶을 선택하기 위해,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학습노동에 시달리며, 학벌 획득을 꿈꾸고 있다 33) . 한국의 학제는 6 - 3 - 3 - 4제이며, 유아교육은 200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무교육화되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그 사회적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보편적인 수준에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성격을 갖지 못한 채 절대다수가 사교육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개개인의 부담을 높여 불평등을 유발하는 동시에 가계복지를 전반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보통교육은 초중등 12년으로 양적 기회는 계층간에 큰 차이 없이 균등화되었으나, 의무무상교육은9년에 불과하다. 그나마 후기 중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까지를 보통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내용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계열별 진로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후기 중등단계에서의 이런 계열 분화와 함께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등을 통해 사실상 차등적 기회배분이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분리로 인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에 따른 부작용과 부담이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내용적으로 중복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7차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10학년 편제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이어져 있다.상급학교에 서열이 존재한다면 그 이전 단계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서열체제 하에서 한국의 학생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심하게 말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경쟁에 들어간다. 하기에 실업교육도 인문교육도, 특성화 교육도 모두 실종되어 버린 채 오직 대학 입시 경쟁만이 남아 있다.무엇보다 대학을 향한 입시 경쟁은 보편교육단계인 초중등교육을 대학에 종속시키고 피폐화시키는주범이며 이미 사회문제가 된 사교육비 문제를 심화시켜 가계경제를 어렵게 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32) 2004. 10. 범국민교육연대( http://www.eduright.net ). WTO교육개방·시장화 저지와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1030 범국민대회 지역순회토론회 자료집. 13쪽33) 이론과 실천. 2004년 6월호 송태수(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중·고교 사회과 교과서 노동교육 분석- 39 -
보수 세력과 기득권층이 나서서 온갖 문제의 주범인양 매도하는 것이 고교 평준화다. 그러나 그 적용 실태를 보면 불완전하기만 하다. 1974년 서울, 부산에서 도입된 뒤로, 현재 일반계 고교의 50.4%,도시별로는 6개 광역시와 17개 중소도시만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을 뿐, 나머지 지역은 비평준화상태다 34) .사실 평준화는 교육과정의 획일화나 학력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에 근거한 잘못된 비난을 받아왔다. 고교 서열체제가 존재하던 당시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위한 입시경쟁과 이에 대비한 사교육이 국가적인 문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등학교진학을 공사립고교를 포함한 고교학군을 설정하고, 선발고사에 의해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학군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을 1974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평준화 적용지역의 중학교육은 이전에비해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일반계 고등학교 중 예체능계 고교(39개교), 과학고(17개교), 외국어고(19개교)는 학교별 선발체제가 가동돼 ‘대학입시명문’으로 굳어져버렸다. 평준화 보완정책으로 치장되어 숫자를 늘려온 특목고는평준화정책과 모순되는 제도로서 평준화의 틀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까지 특목고대비사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특목고의 확대는 입시명문고를 더 늘리는 것으로 특목고 입학을 위한 입시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에 의해 고소득층 자녀가 대다수를 점유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확산시키는거점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런 특목고의 대부분은 설립 목적에 다른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기보다는 대입입시 명문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한편 특목고와 더불어 평준화 보완 명목으로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등의 복잡한 구조는 불필요한 경쟁과 사회적 낭비를 유발할 뿐더러 교육적, 사회적으로 위험스럽다. 이런 ‘특별한 학교들’은 ‘공통의 경험’을 가질 기회를 봉쇄하는 구조이고 부유층 자제들의 집합소처럼 되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실업계는 애초부터 평준화 정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며, 선택에 의해 진학하는 구조이긴하나 사실상 제도적 차별일 뿐이다. 실업교육은 자체의 교육적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미래의 저임금․고용불안을 감내하도록 하는 장치가 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학력인플레에 의해 대학진학률은 갈수록 상승해 현재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이 속에서 많은 실업계가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실업계조차도 학생 정원을 채우지못 한 채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실업고는 95년까지 증가하다가 학교 수 및 학급 수가 감소하고있다. 97년 97만명으로 최대치를 보인 이후 2002년 57만명으로 줄었다. 5년사이에 40%가 감소했다.중도탈락률도 1980년 2.1%, 1990년 3.0%, 2002년에는 4.9%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34)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 정리 1974 , 2 1975 , , 5 1979 , , , , , , 12 1980 , , , , , , , 20 1981 (, ) 21 1990 , , 18 1991 , , 15 1995 14 2000 , , () 17 2002 , , , , , * 23 주: 2002년에 성남시에 분당구가 포함됨.- 40 -
2004년 10월 28일, 교육부는 당초에는 9월 23일 발표하려던 입시안을 일곱 차례나 연기하는 파행끝에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입시안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교육부 후문에서는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농성이 지속되고 있었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대입안의 폐기와 교육부 장관의 퇴진 투쟁을 선언하였다. 입시제도 개편 투쟁은 끝이 아니라 제 2막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교육부 주연, 엑스트라 교육혁신위, 소위 명문대학 조연의 이번 입시안 논쟁은 사실상 학벌주의자인부유층 기득권과 교육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민중과 시민사회의 이념 대립을 주제로 담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입시안 졸속 강행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전교조의 저항이 미미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판단이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통한 것이었든,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망을 통해습득한 것이었든 간에 교육부는 이번 입시제도 개편 투쟁의 과정에 시민단체들을 향해 공공연하게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의지를 꺾으려 했고,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의 옹호를 받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안을 관철시키려 했다.현실적으로 대중의 동력을 동원할 수단을 가지고 별로 가지지 못했던 시민사회진영은 언론의 이슈를 선점하고 논쟁의 새로운 지점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그간, 소위 명문대학들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학력차 반영, 성적우수자 선발이라는 미명아래, 학교교육활동의 결과를 송두리 채 부정하여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통해 출신성분우수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 부유층의 부와 권력을 끌어들여 학벌체제를 구축해 왔음이 밝혀졌다.이번 교육부의 입시안 강행 과정은 교육이라는 기제가 그간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드러냈으며, 저지투쟁과 폭로를 통해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민중의 열망을 전면화한 것이다.이번의 성과를 통해 교육의 차별과 불평등을 줄여 나가기 위한 기득권층과 민중의 전면적인 이념 논쟁이 펼쳐질 것이다.고교등급제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고교등급제가 있으나, 사실 입시안과 현재 진행 중인 고교등급제 논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2008년 입시안에 교육부가 고교등급제를 도입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교육부는 말로나마 반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각 대학의 발언이나 기존의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미 각 대학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왔음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의 핵심이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입시안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고교등급제의 실상을 알기 위하여 교육부가 실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각 대학이 대학별 전형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소재와 그 학교 출신자의 이전 성적에 비추어 해당 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차등의점수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35) 2004.10. 8.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평어, 석차)의 실질반영비율이 매우 낮음* 고려대(1.72%), 서강대(4%), 성균관대(3.54%)* 연세대 : 학생부 상위1% 학생과 상위10% 학생간에 60점 만점에 0.79점 차이◦ 학생부 교과영역 보다 서류평가 또는 논술‧면접의 실질 영향력이 매우 높았음◆ 6개 대학중 연세대, 이화여대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고교유형별 합격자 분포가 편중되지는 않았음◆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는 지원자 출신고교의 최근 3년간 당해 대학 입학자수, 입학자들의 수능성적 등을 전형에 반영◦ 고려대는 ‘보정점수’, 연세대‧이화여대는 고교별 참고자료 활용- 41 -
고교등급제를 둘러 싼 논란을 보면 정의상의 혼란이 드러나고 있다 36) . 교원과 시민단체는 대학이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실태조사결과 각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에 비해, 각 대학에서는 고교간의 학력차를 반영했을 뿐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대학 내에서도 서울대나 주요 사립대에서는 현실적으로존재하는 지역 간의 학력차를 들어 고교등급제 적용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으나, 거점 국립대학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확대하는 위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37) .고교등급제는 사실상 변형된 기여 입학이다. 고교등급을 적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을 통해 학교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 . 시민단체에서는 도대체 부모의 의해 자식의 미래가 차별받는다면 몇 등급짜리 부모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울분을 터뜨리고있다.사실상 다른 나라의 경우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출신에게 일정한 우대조치를 하는 교육평등을위한 제도적 장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오히려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9) . 그럼에도36) 2004. 10. 21.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에서 성열곤은 라는 발제문을 통해 그간 고교등급제의 정의상의 혼란을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정의: 개개인의 능력차이가 아닌 출신 고등학교의 진학실적이나 수능성적 등을 반영하는 행위2 대학의 학력격차반영제 정의: 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출신고등학교 진학실적을 참고하는행위3 일부 보수언론의 고교등급제 정의: 학력이 우수한 고교 출신 학생들을 전형 과정에서 배려하는 행위(고교등급제 수용)이상에서 1번을 보면 대학이 학생 개개인의 능력차를 더 잘 알기 위해 출신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참고했다고 한다면 해당대학을 징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모순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 2번을 보면 논란이 되는 대학들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모순이 발견된다. “우리는 고교등급제는 하지 않았으며 다만 고교를 등급화했을 뿐이다” 3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37) 2004년 10월 13일 전국 9개 국립대 총장은 ‘고교등급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고교등급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계층간·지역간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수도권과지방간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지방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가 참여했다. (2004. 10. 13. 연합뉴스)38) 한국교육개발원의 강영혜 연구원은 10월 25일 발표한 에서 고교등급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고교등급제 발상은 개별학생이 얻은 성적을 그 학생과 무관한 타인(선배들)의 학업성취 수준에 의해 평가절하혹은 절상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있음.- 학생개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어떤 특성과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를 졸업했느냐 보다 그런 학교교육을 통해학생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체화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교등급제 발상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 아닌 피상적인 학교특성으로 학생을 선호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대입선발은 학과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다양한 판단자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고교등급제는 모든 학과 또는 모집단위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모집단위별로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음.- 특히 학생들의 입시준비가 사교육 등 배경변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현실에서 고교등급제의 도입은 교육의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교육여건이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이 제대로 잠재된 가능성을 인정받아선발될 여지를 차단하게 됨.-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특정지역으로 이사도 마다하지 않고 그 결과 특정지역의 지나친 부동산 가격상승이사회 경제적 문제를 낳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역간 학력격차에 기초한 고교등급제의 도입은 사회적 안정과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협할 수 있음.39) 국민일보 2004. 9. 15. 김수정기자. 교육격차를 줄이자 - 해외서 배운다 ⑶ 대학이 차별 없애.미국의 일간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지난해 10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중 가장 역사가 길고 최고 수준으로 평가돼 온 버클리 대학의 충격적인 대외비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버클리 대학의 2002년 신입생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격인 SAT 성적(1600점 만점)이 600∼1000점대에 불과한학생이 400명에 달했다. 반면 SAT 1500∼1600점을 받은 641명과 1400∼1500점대를 받은 2600여명은 불- 42 -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일부에서 이를 계기로 고교평준화를 해체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대학별 본고사2002년 수시입학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나 수능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대학의 특성과 건학이념을 반영한다는 논리로 구술 심층 면접이 실시되었다. 그렇다면 도입된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제형 지필고사의 형태가 아니라 면접관과 수험생의 심층적이고 개별적인대화가 중요할 것이다.그러나 이런 취지에 도입된 구술 심층면접이 사실상 과거 문제가 많아 폐지되었던 본고사의 부활이었음이 드러났다. 교원 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는 올해 1차 수시에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이 심충면접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한 논술고사의 문제를 분석하여 이런 사실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40) .이러한 본고사식 논술고사의 시행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의존을 크게 해 고교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이끌게 되며, 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을 주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논술고사는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교육여건이 좋고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좋은 강남권 학생들과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고사라고 볼수 있다. 이렇듯 대학별 고사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상황에서 공교육 기관이 입시로부터 독립하여 정상화의 길을 갈수는 없다. 하기에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여 금지해야 한다.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신뢰도고교등급제 적용과 사실상의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비난을 받자 각 대학입학 관계자들은 10월전국대학입학처장회의를 열어 각급 고등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실태를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자신들의 부도덕성 비판에 대한 반격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그동안 각 대학들은 정시입시에서 내신 부풀리기를 핑계 대면서 수능의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여 왔합격 처리됐다. 수능 소수점이 몇 점이 모자라 대학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점수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는 입시 비리가 아니면 사상 최악의 학력 저하라며 온 나라가 들끓었을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공립고교를 졸업한 마이클(가명·18)은 SATⅠ 1000점, 고교 GPA(내신성적) 3.95점의 성적을 갖고 지난해 버클리에 지원해 합격했다. 2003학년도 버클리 신입생의 평균 SAT 점수가 1340점, 평균 GPA가 4.15점이었던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상향 지원이었던 셈이다. 게다가 마이클이 졸업한 고교는 캘리포니아주가 각 학교에 매기는 학력평가지수(API) 1∼10등급 중 3등급에 불과한 데다 무료급식을 받는 학생이 41%,학부모의 평균 연수입이 2만6000달러(약 3120만원)인 이른바 고교 등급상 ‘하위 학교’에 속한다. 저조한 성적과 고교 등급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이 명문 버클리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데는 이유가 있다. 2002년부터 버클리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기존의 학업 성적 위주에서 성적과 사회 봉사, 재능, 지도력, 가정환경, 출신 배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사정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버클리는 마이클이 어려운 환경에도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GPA를 얻은 데 주목했다. 가정의 연 평균 수입 1만7400달러(약 2088만원),부모의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열악한 가정 배경이 오히려 마이클의 잠재력을 증명한 것이다.40) 2004. 10. 12 ‘올바른 대입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는 에서 다음과 같이 본고사 시행 상태를 조사 발표하였다.- 학생들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시되는 문항으로 학생부의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아니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시하고 답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측이 내세우는 대학의 특성이나건학이념을 고려한 문제는 없음.- 대부분 대학이 논술로 국어, 영어, 수학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의 사고능력을 시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적성검사도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별로 없어 변형된 본고사임.- 난이도에 있어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매우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 43 -
다. 그 결과 내신 성적의 실질 반영률은 2002년 9.62%에서 2004년 8.21%로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나마 수능성적이 반영되지 않아 학생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있을 거라고 예측되던 수시에서 조차 내신의 실질반영률은 교육부의 조사결과를 보면 고려대 1.72%,서강대4%, 성균관대 3.54%였으며, 연세대의 경우 학생부 상위1% 학생과 상위10% 학생 간에 60점만점에 0.79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이도 부족하여 특목고나 일부 고교학생들에게는 보정점수를주는 식으로 내신을 무력화시켜왔다. 즉, 내신이 부풀려져 있기에 내신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학교교육을 부정했기에 내신을 믿지 않은 것이다.현재 고등학교의 성적 산출은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와 평어에 의한 절대평가 자료를 동시에 산출하고 있다. 각 대학의 요구에 따라 단독이나 혼합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1차 수시에서도 대학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평어에 의한 절대평가에서야 부풀리기가존재한다 하더라도 석차에 의한 상대평가는 같은 석차의 경우 중간 성적을 부여한다는 원칙만 있으면부풀리기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은 특목고나 강남지역 학교에 보상을 주기 위해절대평가 결과와 동석차의 경우 최고석차 원칙을 적용하여 오히려 문제를 조장해 왔던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2002년 석차내신을 60등급으로 나누어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나 그 후점차 이를 수정하고 본고사 요구, 등급제 요구로 퇴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내신 부풀리기는 왜곡된 대학입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또한 학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교육활동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이사회에 공익성을 띤 이사진이 포함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사립재단들은 학교폐쇄로 맞서고 있다. 이는 그간 한국사회에서 사립학교가 교육의 공공성보다는 재단의 영리를 위한 수단이었음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다.사립대학 비중이 4년제 대학의 경우 약 75%, 전문대학을 합치면 83.3%(학생수 기준)로 세계적으로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는 한 마디로 국가가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사립대학의 역사는 첫 걸음부터 얼룩진 것이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민중의 폭발적인 교육 수요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원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지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 다수 지주들이 토지개혁에서 토지 분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립대학 건립에 투자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고등교육 수요 폭증에 대해 정부가 사립대학의 설립을 남발함으로써 대학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비중이 매우 높다. 이 중에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대학들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사립대학은 비영리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의 사유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패와 부실의 온상이 되어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학은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전입금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이사장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구조와 관행으로 사실상1인 독재체제나 다름없는 사립대학이 많다.사립대학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대학교육의 공교육화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사학법인 이사장들은 그동안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직접 참여하거나 강력한 로비를 통해 이사장의 대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각 지역에서 토호세력으로 지방권력에 영향력이 크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사장들이 사립대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에 대해 별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44 -
서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이 선결요건이다. 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둔 교육을 펴고 있는 유럽은 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데 반해,국가주의 교육을 펴는 한국에선 교육비를 거의 다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경제력이 약해서이고, 우리도 선진국이 되면 유럽과 같은 공교육이 확립되고 교육복지가 이루어 질 것인가? 교육을 상품으로 여기고, 경쟁의 수단으로 여기는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경제력이 상승한다할지라도 교육의 공공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기에 교육불평등 극복의 제일 방향은 교육의 사사화로부터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다음으로 교육소외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빈곤으로 인한 학업중단자들의 문제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생활의 기본인 무상급식으로부터 교육 전 과정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또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통합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에게도 기본적인 무상의무교육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학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분쇄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이 활동의 과정으로서의의미보다는 결과에 의한 서열화로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급별 연령별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한 이에게 고른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육조건 및 활동과정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의 교육 기회 격차해소해야 한다. 도시내에서도 하며 거주지역에 다른 교육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현실적으로 지방의 재정 규모에 격차가 심각한 현실에서 단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교육을 지방정부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또한, 농어촌 학교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교육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농어촌에 주민이거주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산물의 급식은 이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있다. 유기농 우리 농산물은 지역의 소농경제를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교육재정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6% 확충하겠다고 했으며,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서 7%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2003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4.3%였다. 이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줄이는 법안을 지난 2004년 9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금 가운데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없애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13%에서 19.32%로 상향조정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 45 -
부금의 규모가 현행보다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교부금은 2005년 19조 7천억원(2004년 18조 8백억원에 비해 1조 6천억원 증가)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으로 국가가 중학교 교원의 봉급까지 마땅히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부담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중학교 교원의 봉급 분만큼 늘어나는 재정을 새로이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정 구성의 변화 및 비율 조정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재정의 총량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시설비나 운영비의 삭감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경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사회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이미 무상교육기간 중에있는 중학교에서조차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 중고등학교)를 아직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41) .이는 대표적인 사부담 공교육비로서 국가 재정이 적을 때,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 것으로, 당연히없어져야 하는 것이다.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되어 있다.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고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수록 교육에 소외를 당하고 이런 교육소외계층이 다시 저임금 비정규노동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나아가, 대학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미 대학교육은 소수의 경제력을 갖춘신분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대학교육의 기회는 연령, 인종, 경제적인 능력의 다름을 넘어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회를 놓쳤거나 직장을 가진 후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개방되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학교육은 년간 천만원정도의 등록금과 이에 버금가는 학비를 들여야 하는 시스템이다.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학교육이 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학서열이 온존하는 한 무상교육은 학력인플레를 유발하며, 엄청난 사회적인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무상교육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학력인플레를 줄이고, 대학의 학문을 개인의 권력획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정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실질적으로 대학교육을 열망하는 수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대학교육의 사사화는 그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에 그 파장이 고스란히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문제이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인 ‘중등은 공공성 강화’ ‘대학은 시장경쟁력강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호는 단지 교육을 경제에 종속시켜 대학교육에 투여해야할 노력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위장일 뿐이다. 대학이 시장으로부터 벗어나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때에 비로소 학교가 희망의 교육 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대학이 사회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비판적 이성을 갖춘 지식인을 양성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41) 2004.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http://www.soonyoung.net) 2002 193 2,7002003 198 2,9002002 193 3,4002003 191 3,500- 46 -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교육이 공교육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권력 획득의 수단으로,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대학을 학문 중심의 교육 공동체로 바꾸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대학의 졸업을 통해 기업에취업하는 구조는 정부가 돈을 들여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무상교육을 통해 양성된 대학의 학문과 지식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 문화, 도서관 등의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 자리에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학 졸업자들이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나아가 의료, 교육, 법률 등의 전문직의 진출 또한 고시와 같은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대학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들 중에서 선발 임용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럴때에 비로소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차별 없는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대학교육과정을 바로 세우는 학문의 자주성은 다시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미 학문의 대외종속은 충분히 심화되어 있으며, 더 큰 문제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식민지화는 사회의 식민지화보다 더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학문의 체계와 교과과정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신의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별 인재할당제대학서열체제로 인한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가 지역별로 등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성할당제와 같이 한시적으로 각종 공무원 채용에서 대학출신별 지역할당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법관, 검사, 행정사무관, 외교관, 하급행정공무원 등 모든공무원 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조세제도의 개혁복지를 실현하기에 충분한 경저제거 조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한 사회는 경제와 복지의 양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의획기적인 증대가 요구된다.이는 민주노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상교육실현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학력학벌간 차별금지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화해야 한다. 학력차별금지의 기본 방향은전 인사과정에서 학력란이 폐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집 시 학력차별의 금지(“대졸에 한함”,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에 한함” 등 금지), 채용 시 학력차별의 금지(직무경력과 구분하여 학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금지), 임금수준 결정 시 학력차별의 금지(호봉산정이나 연봉계약 시 학력반영 금지), 승- 47 -
진 시 학력차별의 금지(특정학력자의 승진비율에 "4/5 원칙 42) 적용), 기타 배치, 교육훈련, 퇴직 등인사과정에서 학력차별의 일체 금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공직의 학벌 독점 금지교육의 사사화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독점에 있다. 사회 권력을 일부 대학이 독점하지못하게 해서, 여러 곳에 권력이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몇개 대학 출신이 일정비율 넘게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한국에서는 관료제 사회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직을 몇 개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대학의 공직 독점은 다른 분야까지 영향을 끼친다. 기업에서 서울대 출신을선호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보다 공직이 서울대에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시민사회위에 군림하는 한국에서는 기업 운영을 할 때도 언제나 국가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학벌 권력이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따라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역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인식아래 보다 적극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임명시 특정대학의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고위공직자 가운데 특정대학 출신자가 30%를 넘는다는 것은, 공직의 공익성을 포기하는 것과마찬가지이다.평생재교육시스템의 구축초중등교육은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중학교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무상의무교육이기에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이 적게 나타나지만, 초중등 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계층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고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직업일수록 계속교육의기회가 더 많으며 직무를 통해 직업능력을 계속 습득해 가고 있으며,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 기회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이다.반면에 평생학습이나 계속교육이 필요한 집단은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기에,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도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규학교가아닌 다양한 형태의 실용적인 재교육시스템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도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제자리 찾기가 선행되어야 한다.우리나라가 성인학습활동에 소홀한 것은 국제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43) .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5~29세 연령층의 중등교육 이수비율은 한국이 95%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42) 4/5 원칙(four-fifths rule)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판정하는 계량적인 방법이다. 예를 들어 한 단체내에승진대상이 다수인 A 집단은 30명이고, 소수인 B 집단은 10명이라고 하자. 승진인사 결과 A 집단은 15명이승진했고, B 집단은 3명이 승진했다. 이 경우 A 집단의 승진률은 50%이고, B 집단의 승진률 또한 50%라면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사행정상 4/5라고 할 수 있는 40%인 4명이 B 집단에서 승진한경우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3명인 경우는 명확하게 차별이라고 계량적으로 판단하는 원칙이다.43) 2003년 6월 KEDI포럼에서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란 주제발표에서 평생교육예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제비교를 자료를 발표했다.< 주요국의 평생교육 예산 >- 48 -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에 비해 최하위 수준이다.사회적 일자리 창출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기업들은 임금과 노동시간의 통제를 유연화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을 확대해가면서 노동자들의 분화가 확대되고 있다. 즉, 대기업에서조차 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않으면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외주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규직은 핵심업무를 담당하고, 비정규직은 주변업무를 맡는다는 관행조차 깨드리며, 비정규직이 기간노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지금의 상황은 노동자가 ‘기업내 정규직 - 기업내 정규직 - 불안전고용노동자’ 등의 체계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말 ‘구조조정’이름아래 진행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초기에는 기업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에서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미명으로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단체에서 대안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등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나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확충 등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이 결과 국민 전반의 삶은 안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빈곤은 확산되어 가고 있다.이는 생존의 절박한 문제이지만 교육차별과 소외의 문제이며, 나아가 학문진흥의 문제이기도 하다.이처럼 불안정한 고용 전망아래에서 단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는 학력의 인플레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취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벌어질 일은 더욱 부정적이다. 박사학위를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공채에 응시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기형적인 취업시장의 형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같은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외국어 수준만을 최우선으로 삼아 채용을 하는 식으로는해당분야의 전문성도 획득할 수 없을뿐더러 독창적인 발상 역시 얻을 수 없으며, 학문의 발전은 전혀기대할 수 없다.학문의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학문의 종속을 막아야 한다. 기업차원의 일자리를 통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업의 문제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한 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왜곡된 열망이 대학을 지배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한정된 자리를 획득하기 위한 왜곡된 교육열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일 뿐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공의 영역에서의 공익적인 일을 할 수 기회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 해소의 길이다. 6 5,798 4,023 6.1% , , 56 2 59110 10.5% 23,146 6,565 29% 24,404 928 0.038% (2003 )- 49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교육:토론1“교육불평등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토론문최순영(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발제자의 한국 공교육체제의 불평등 현황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한국사회의 공교육이 사회적평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을 통해 사회 불평등의강화 기제가 되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음.□ 특히 계층간 교육비지출의 격차 심화는 현재의 교육체계에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학력이 결정되고, 강고한 학력주의 체제는 사회적, 문화적 자본과 결합되어 새로운 사회권 권력형성의 핵심적 지표가 되고 있다는 발제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함.□ 이는 단순한 경제적 권력뿐만이 아니라,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정신적 문화적 자본, 생활영역의불균등 조건, 교육과정과 자본위주의 담론구조 등과 결합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 불평등 체계에대한 풍부한 해석이라고 판단됨.□ 상황이 이럼함에도 불구하고 현정부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 기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인, 교육빈공층, 외국인노동자 및 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교육안전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 뿐 아니라 현정부는 대학재편을 통한 대학의 수직적 기능분화(연구-교육-직업) 및 이에 따른 초중등 교육체제의 사실상의 계열화(특목고, 영재교육, 자사고, 수월성교육 등)를 통한 교육전반의 갈라치기(Tracking) 정책, 교육개방과 시장화 정책을 2010년까지의 추진계획을 가지고추진하고 있음. 결국 경제-사회-문화적 자본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학력주의체제와 현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시도가 맞물려 교육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및 주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50 -
□ 발제자는 교육불평등 극복을 위해서 “무상교육실현, 대학서열체제 타파, 사회제도의 개혁-지역별인재할당제, 조세제도의 개혁, 학력학벌간 차별금지, 평생재교육시스템 구축,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제기하고 있으며, 토론자는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함. 물론 교육평등을 위한 과제는 위에서 제시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님, 발제문 곳곳에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중요한 것은 한국사회 공교육체제의 근본적 재조정 및 관련 사회제도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특히, 발제자가 제시한 평생교육부분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 동안 진보운동, 진보정당운동에서 주요 의제로 삼지 못하였던 부분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평생교육이 학교교육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사유화된 영역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운동 및 진보정당의 교육정책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사료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교육평등 강화 방향에 대한 선언만이 아닌,그 개선 방향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구체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고 이를 법률, 예산, 일상적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임. 특히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라는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정책을 제한적 조건에서나마 실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내적으로는 민주노동당의 현재적 조건은 이를 위한 충분한 과제 정리 및 역량 성숙이 부족한상황임. 각각의 과제들을 위한 법규정의 어떤 부분을 바꾸고, 이와 연동되어 어떤 예산편성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도출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당은 관련 연구팀을 구성, 운영하여올해 내에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위한 로드멥과 각 단계별 실현과제를 제시할 계획임. 또한의원실은 이렇게 제출된 과제를 법률, 예산 등을 통해서 실행해 나갈 것임. 17대 국회가 끝날때 민주노동당은 교육공공성과 교육평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활동을 했다는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 평가를 위해서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자기 계획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04년 총선을 통해서 원내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아직 의정활동에 있어서 명확한 자기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6월 등원이후 원내활동 적응기를 거쳐 바로 국정감사를 거쳤으며, 고교등급제, 사립학교법, 교육개방 등의 굵직한 교육이슈들에 대한 대응이라는 상황적 조건에서 4년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과제를 수립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음.□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관련 현장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거대한 소수” 전략을 통한- 51 -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의 전형을 일정정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음. 그러나 국정감사는 싸움을위한 전단계에 지나지 않음. 현재의 의정활동 방식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한 교육정책의 변화는형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음.□ 국회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안과 예산심의 부분임. 법률안 부분에서는 그 동안의교육운동, 진보운동 진영에서 운동으로서 성과로 정리되어 왔던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을 발의하여 원외의 목소리를 원내에 법률안이라는 형태로 반영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법률안의 구체적인 정리라는 과제가 남아 있음. 또한앞서 말했듯이,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위한 1단계 법개정안 정리 및 발의라는 과제 또한있음. 이는 올해 내에 꼭 해야 할 과제임.□ 작년 예산심의에서 교육위에서 특수교육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는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바 있음. 그동안 진보운동, 진보정당 진영은 예산 즉, “돈”문제에 대해서 마인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아직 교육관련 예산 전문가 또한 당에 없으며,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부가 인지케 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편성시부터 관련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이 또한 올해 의정활동의 역점사항.□ 대부분의 법은 언제나 예산문제를 동반함. “무상교육과 대학평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정에도 예산문제가 동반됨. 과연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이의 확보방안에 대한 과제 정리가 필요함.□ 발제문에도 드러났듯이 교육문제는 교육외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임, 청년 실업 문제, 지역격차문제 및 지역별 인재 할당제, 조세제도 개혁과 학력차별금지 등은비단 교육부문에서만이 아닌 전체 국가 정책적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임. 작년활동의 경우 타상임위 소관이지만 교육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예-교육개방관련한 교육특구: 행자위, 개방협상: 통외통위, 재경위, 산자위 등)에 대한 공동 노력이 부족하였음. 앞으로는 당 정책위원회가중심이 되고, 관련 타 상임위 의원들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러한 사회적 개선과제들을 정책입안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앞서 말했듯이, 아직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에 걸맞는 의정활동의 전형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음. 현재의 의정활동은 여전히 중앙정치 중심의 정치구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역교육사안과 같은 경우 지역 교육위원, 지자체 의원들이 충분히 이에 대해서 개입하고 개선할여지가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이후 모든 사안들이 중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자체의원들이 소외되는 현상을 가지고 오기도 함. 현재 법규상 예산편성 등많은 사업 재량이 지역 고유사무로 이관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앙차원에서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역차원에서의 개입과 주도가 필요함.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교육위원들 간의 정확한 관계설정이 필요함. 현장에서의 교육평등을 위한구체적인 사업과 예산편성이 진행될 때 교육평등의 진정한 의미는 발휘될 수 있음. 이를 위한민주노동당 시도당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52 -
□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교육체제의 신자유주의 재편이 10년째에 이르고 있음. 그 동안 초중등 교육은 7차 교육과정과 특목고, 자사고, 영재교육 등의 정책으로, 대학영역은 대학 자율성과 특성화를 빙자한 학문의 시장화정책, 대학의 기능분화 정책, 교육시장화 개방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음. 95년 교육개혁안 발표 직후 교육운동, 진보운동 진영은 이에 대한 명확한 비판지점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었음. 그러나 이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 2005년 5월 31일에는 민주노동당 주최로 그 동안 정권에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 10년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함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년간의 긴 호흡을 준비할 수 있는장이 마련될 것. 민주노동당이 지금 당장 힘이 없는 것은 용서될 수 있어도, 계획과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을 것.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장기적 계획과 꾸준한 실천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임.- 53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교육:토론2교육 불평등 해소 대책과 향후 과제 : 토론윤종혁(한국교육개발원) 교육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현재 각계 각층에서 이와 관련된 이론·실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움직임 자체가 흔히 말하는 올바른 의미의‘개혁’ 혹은 ‘개선’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자가 제안하는 우리 교육의 우울한 모습, 공교육의 위기와 교육으로 인한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에 대한 분석도 과연 ‘개선’의 대안으로서 효과적인 것인지 좀 더 점검이 필요한 내용이라고생각한다.기본적으로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주제 원고가 담고 있는 우리 교육 현상에 대한 분석과 위기 심화현상, 계층간 차별화된 교육 분배 등에 대한 소견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이다. 더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이 아닌 ‘혁명적’ 교육 대안을 통해 새로운 교육을 구현하는 사회를 탐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발표자와 본 토론자의 공유된 감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상을 애써 외면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 비롯한 것이기도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현실 상황’을 제대로된 ‘현실 그 자체’로 설명하지 못하는 우리 교육 주체들의 마음자세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본다.그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이 분야에 일천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발표자 원고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장점과 분명한 전망을 보완해 주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실 상황’에 대한 재해석과한계에 대해서도 감히 지적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우리 공교육이 위기에 빠지고 교육의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주로 불철저한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는 거시적인 분석, 세계 체제론적인 측면에서 타당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은 서양 근대화 과정에서 성공하고 있는 ‘자율적 개인의이념’과 ‘공화국 이념’을 모두 실현하지 못했다고 말한다.그런데 토론자는 이 부분에서 특히 ‘공화국 이념’에 대해 주목하고 싶다. 우리 교육이 바로 서양 근대화의 과정과 동일한 부분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화국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는 교육이 가질 수 있는 공공성과 평등성,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수월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이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쉬- 54 -
운 것은 발표문 전체적으로 볼 때 ‘공화국 이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비전과 대안이 무엇인지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바로 그 점에서 누군가 이 논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 불평등은어떤 현상을 말하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당위적인 원칙과 강령 중심의논리로 빠질 우려가 있다.이런 현상은 교육의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발표자는 자본과노동, 나아가서는 세계화된 국제자본과 노동간의 모순으로 인해 교육 격차 및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이 발생한다고 간결하게 정리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조사(2003)에서도 가정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되며, 2005년 3월 1일자 언론 보도를 따르면 가구당 소득 최상위 10%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최하위 10%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약 7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원인 분석 과정에서 발표자는 자본과 노동 ‘계급’간의 대립·분열에 따른 모순, 혹은 교육적 상황에서 ‘계층’적 대립 등 계급과 계층을 혼용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상황과 교육 불평등 상황 사이에 모호한 구별이 있거나, 혹은 교육이 지닌특수성을 표현하는 것이 개념 정립 과정에서 혼동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두 개념이 반복 혼용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교육 불평등 현상을 이해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어찌되었건 발표자는 공교육 위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교육이 <strong>양극화</strong>되었다고 주장한다. 물론 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체 전반에 걸친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학벌 사회, 교육 불평등, 교육 소외 현상이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현상이 가지는 한국적인 특수성 혹은 세계사적인 보편성에 대해 치밀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방대한 내용과 자료를 정리·소개하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연구 역량을 발휘한 발표자에게 그 이상 요구는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무엇이 주된 교육 <strong>양극화</strong>의 원인 제공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력 요소는 어떤 것이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이런 문제점은 교육의 <strong>양극화</strong> 및 공교육 위기가 교육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한 부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해온 물적 증거들은 여러 측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교원 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를 비롯한 고등학교 체제 개선, BK 21 사업, 인적자원 육성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장관은 물론 교육인적자원부의 실무담당자 및 관련 연구자들도 자신이 신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유령 ‘신자유주의’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미묘한 것은 일부 경제계 및 언론계 등 ‘진정한 신자유주의자’들도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에 대해한 마디씩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교육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의 속성은 결국 자본의이해(달리 표현하면, 국가 경쟁력의 ‘이중적’ 속성)에 따르는 것에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적인 특수성으로서의 교육 모순이면서 세계사적인 보편성도 동시에 공유한다고 본다. 발표자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정의하였다. 말하자면, 노동과 자본간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자본주의적인 쟁점, 그로 인해 표현되는 교육 영역의 문화자본, 학력자본, 인력자본 등의 소유 여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자율적 인간’의 이념으로서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통제받는 방식으로 압축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그런데 발표자는 아주 세세한 영역으로서의 계층간, 집단간, 지역간, 교육제도 측면의 교육 불평등- 55 -
현상에 대해서는 작은 그림으로 생략하는 느낌이 든다. 이에 대해 본 토론자가 앞으로의 교육개혁을위한 자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 보충 제안을 하고자 한다.첫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 공교육화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내부 상황을 보면 이는 ‘교육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다름이 없을 정도로 통일된 원칙이 세워진 것은 아니다. 아직도 교육·복지부간의 어려운 대면, 그리고 여성부의 역할 등 몇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으며, 이 부분은 큰 차원에서 ‘공화국의 이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둘째, 무상의무교육을 중등교육 단계 전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에 대해 토론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특히, 읍면 이하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물론 비평준화 지역 학생, 실업계 고교생의 문화적 결핍 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아의식 및 자아존중감이 대도시 및 평준화 지역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되고 있다 - 김양분 외, 2003; 윤종혁 외, 2004. 참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단계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기존 사립고등학교를 개편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학교 설립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사학을 제외하고는 국가 차원에서 공립학교로의 전환 및 폐교·통폐합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셋째, 학제 개편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등·고등교육의 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교육은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어려운 과제이기는 하지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점화, 지방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대입 전형을 다양화하거나 혹은 무시험 전형으로 발전시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향후 통일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남북한간 학제를 쉽게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참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에서 북한 학제가 가지는 우수성(유아교육, 수재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넷째, 계층간 교육 불평등, 지역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교육적인 해소 대책으로 마련될 수는 없다고 보며, 사회경제적인 개혁을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있음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문화자본·사회자본·학력자본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엄청한 지식과정보를 가진 교육 기득권층에 대해 이 이상의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적인 수준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 빈곤계층 등 소외집단에 대해 ‘공격적인 교육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을 때 ‘공화국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방대한 양의 발표자 논문에 대해 본 토론자가 이런 저런 식으로 논급하는 것 자체가 약간 불공정한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굳이 토론을 받아들인 것은 발표 원고를 몰이해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였음을 밝힌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문제는 남아 있다. 교육의 불평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개인’의 문제에서, ‘사유성’과 ‘공공성’의 문제에서, 그리고 ‘수월성’과 ‘평등’의 문제에서 서로 다른 쪽을 달가와하지 않는 양상이 그것이다. 국제수준 학업성취도 검사(PISA 2003, TIMMS-R 2003) 결과를 통해서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에 대해 안심하면서도, 이것이 지닌 우리 교육의 양면성에 우려하는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 「 :」, , 2003. , 「 (Ⅰ)」, , 2003., 「 (Ⅱ)」, , 2004. , 「 」, , 2004. , 「 」, , 2002.- 56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교육:토론3‘교육불평등의 현황과 대안’에 대한 토론노옥희(울산광역시 교육위원) 단순화한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제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한국사회에서 교육불평등이 발생하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첫째,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둘째, 실제 교육활동이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셋째,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등 교육의 전과정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각 측면에서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경제력,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등의 사회적 요인이나 가정적 변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주지역, 문화자본, 사회적 지위 등의 요인은경제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제자는 대체로 가구 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여건의 차이 때문에 교육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상급학교 진학정도, 사교육비를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느냐, 또 이러한 결과로 학벌이나 학력을 어느 정도 획득할 수있느냐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고 대물림되고 있다고 발제자는 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발제자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로 인해 형성된 학벌이나 학력 이데올로기가 최대한 작동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회적인 대책과 교육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사회적인 대책으로는 지역별 인재할당제, 학력간 차별금지, 공직의 학벌 독점금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등을 제시하고 있고, 교육측면에서의 대책으로는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학벌 형성이나 학력 이데올로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적 여건의 차이가 교육불평등으로 연결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의 확대,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과 학교 교육여건의 차이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0. 발제자가 주장하는 ‘교육불평등의 현황과 대안’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지만 대안 제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고리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 57 -
적하고 싶다.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현황과 대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도 하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한다.0. 다음으로 교육불평등 해소를 주도해 갈 주체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교육불평등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교육주체가 중심이되는 대중조직과 정당이 어떤 내용에 대해 역할을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한다.0.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 중등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우선 과제로 할 것인지, 초, 중등교육이 실질적이고 질높은 무상의무교육이 되도록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원 증원, 수익자부담경비의 학교부담, 특기적성교육의 흡수 등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것을 우선과제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전자는 대학입시 경쟁의 완화를 통해서 초, 중등교육을 정상화하여 교육불평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라면, 후자는 경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적으로 부담하여 경제적 차이에 의한 교육불평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전자는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후자는대중적인 관점에서 대중을 조직하고 실천 투쟁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가 쉽지않다고 본다.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정도로 볼 때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교육적 차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으로 볼 때도 고등학교까지의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 요구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원 증원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서열체제 타파에 대해서는 당장에 대중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발제자의 견해는?0. 발제자가 교육불평등 문제의 극복방안으로 교육적인 대책과 사회적인 대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불평등 내지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다보면 결국은 학력과 직업에 따른 임금격차,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인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제대로 된 결론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함께 해 가야 할 문제이지만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중요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견해는?- 58 -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질병․장애․배우자 사망․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결핍의경우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건강이란 경제적 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향유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76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규범이다.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일상의 냉혹함 속에서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다. 한 쪽에선 수백만을 호가하는 검진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수술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운 좋게 방송에 포착된자만이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극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있을 뿐이다.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한국의 현실이다.그런데, 건강할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현실은 빈곤 심화 및 사회 <strong>양극화</strong>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구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빈곤 및 사회 <strong>양극화</strong>의 핵심 주제 중하나인 실업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실업 자체가 각종 질병의 유병률과 사망률을 극단적으로 증가시켜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실업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4) . 이렇게 건강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이 IMF 이후 폭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구조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더욱이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인구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건강의 불형평성 문제가 더 확대되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정 고용은 저임금으로 연결되고 그 결과 의료 이용에 경제적 장벽이 커질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고용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의료 이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44) 김창엽. <strong>빈곤과</strong> 건강. 한울. 2003.- 59 -
벌어지기 때문이다. 치료비는 고사하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리고 언제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맘 편하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것은 쉽게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노말헥산중독 사건이 이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할 수 있다.또한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은 <strong>빈곤과</strong> 건강의 악순환을 가져오는구조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도시가계 조사를 보더라도 IMF 이후 하위 1분위와 상위10분위 간 소득점유율 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5) . 임금노동자의 노동배분율도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소득계층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대적 빈곤 문제 해결을위한 잔여적 복지체계의 구축만으로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여전히 잔여적 수준의 최소 안전망 구축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이용의 불형평성과 건강수준의 불형평성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의료이용의 불형평성 문제는 건강보험의 이용 양태를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입원 진료비만 보면 하위 1분위와 상위 10분위 간에 차이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급성질환의 경우 소득계층간 차이가 크지 않지만,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가입자의 경우 소득계층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94,632 1.00 98,386 1.002분위 91,413 0.97 90,618 0.923분위 91,286 0.96 86,316 0.884분위 89,405 0.94 88,947 0.905분위 86,863 0.92 87,482 0.896분위 89,128 0.94 91,720 0.937분위 89,136 0.94 91,719 0.938분위 92,467 0.98 95,644 0.979분위 95,911 1.01 99,790 1.0110분위 105,746 1.12 105,427 1.07표 2.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4,438,116 1.00 4,911,517 1.002분위 4,357,866 0.98 4,697,093 0.963분위 4,558,925 1.03 5,010,602 1.024분위 4,591,226 1.03 5,093,183 1.045분위 4,616,014 1.04 5,142,677 1.056분위 4,988,518 1.12 5,144,098 1.057분위 4,795,896 1.08 5,299,079 1.088분위 4,870,803 1.10 5,531,061 1.139분위 5,171,800 1.17 5,774,991 1.1810분위 5,461,399 1.23 5,939,057 1.2145)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60 -
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면 문제의 성격이 명확해진다.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때문에 입원서비스 자체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보면, 전체의 경향과 달리 하위 1분위가 상위 10분위에 비해 평균입원진료비가 오히려 크다. 반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입원진료비가 커진다는 점을 더욱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위 계층은 상위 계층에 비해 만성질환에 따른 입원이 상대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유추해볼 수 있고, 또한 서비스의 이용도 종합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입원 서비스에서 적정한 질을유지하기 어려운 의원급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표 3.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원 평균입원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116,688 1.00 94,103 1.002분위 98,249 0.84 103,633 1.103분위 111,006 0.95 104,104 1.114분위 111,949 0.96 99,528 1.065분위 122,156 1.05 96,492 1.036분위 106,407 0.91 97,242 1.037분위 116,639 1.00 95,761 1.028분위 92,605 0.79 111,303 1.189분위 111,457 0.96 80,203 0.8510분위 93,049 0.80 78,250 0.83표 4. 소득구간별 복합만성질환 건강보험 가입자의 종합병원 평균입원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3,198,657 1.00 3,460,949 1.002분위 3,264,886 1.02 3,493,761 1.013분위 3,413,751 1.07 3,781,995 1.094분위 3,458,839 1.08 3,850,968 1.115분위 3,449,388 1.08 3,891,593 1.126분위 3,738,214 1.17 3,915,587 1.137분위 3,548,782 1.11 3,862,052 1.128분위 3,597,211 1.12 4,199,730 1.219분위 3,833,379 1.20 4,366,249 1.2610분위 3,921,988 1.23 4,418,509 1.28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의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은 외래 진료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하위 1분위에 비해 상위 10분위의 평균외래진료비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42%, 지역 가입자는 45%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입원과 외래를 모두 포함할 경우 상위 10분위는 하위 1분위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이상 의료이용량(평균진료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러한의료이용량 분석에 비급여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비급여가 포함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 예상된다.- 61 -
표 5.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평균외래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149,378 1.00 148,882 1.002분위 167,271 1.12 159,304 1.073분위 177,636 1.19 167,774 1.134분위 184,398 1.23 174,901 1.175분위 181,775 1.22 174,982 1.186분위 187,794 1.26 183,802 1.237분위 187,075 1.25 184,658 1.248분위 192,779 1.29 193,143 1.309분위 201,909 1.35 207,688 1.3910분위 212,726 1.42 216,050 1.45특히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은 연령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0-74세의 노인만을 보면 상위 10분위의 노인이 하위 1분위의 노인에 비해 의료이용량에 있어서 직장 81%, 지역 68% 가량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재와 같은 의료보장 체계가 유지된다면 노인에게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strong>양극화</strong>되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 확실시된다.표 6. 70-74세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입원진료비(2002년)보험료 구간 직장 지역1분위 237,541 1.00 247,487 1.002분위 314,226 1.32 294,944 1.193분위 296,778 1.25 298,553 1.214분위 328,856 1.38 326,386 1.325분위 310,294 1.31 315,555 1.286분위 317,961 1.34 333,715 1.357분위 340,699 1.43 332,786 1.348분위 332,641 1.40 338,580 1.379분위 353,395 1.49 381,093 1.5410분위 430,399 1.81 416,612 1.68 의료 및 건강의 <strong>양극화</strong> 현상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문제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정도로 급속하게 인구 구조의 노령화를 경함하고있다. 고령화 사회를 의미하는 노인 인구 7%를 2000년에 돌파한 이래로 19년 만에 노인 인구가14%가 넘는 고령 사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2050년 이후엔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이 높은 고령 사회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62 -
표 7. 주요 국가의 인구고령화 속도도달연도소요기간(년)7% 14% 20% 7%~14% 14%~20%한국 2000 2019 2026 19 7일본 1970 1994 2006 24 12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독일 1932 1972 2012 40 40영국 1929 1976 2021 47 45이탈리아 1927 1988 2007 61 19미국 1942 2013 2028 71 15스웨덴 1887 1972 2012 85 40자료: 이혜훈, 「인구고령화와 개정의 대응과제」,『경제사회여건변화와 재정 역할』, 개발연구원,2001이러한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는 폭발적인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1년 현재 건강보험에서 노인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8%를 넘어섰고, 건당진료비에서 노인이 청장년층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그 증가속도 역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현재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노인급여비가 8조5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100,00080,00085,962억원60,00040,00042,00720,0001,6214,89316,43601990 1995 2000 2005 2010그림 21. 노인급여비 추이 (1990-2010)자료 : 김창보. 노인급여비 추계. 건강보험동향 2000. 9에서 수정 재인용이렇듯 인구구조의 노령화는 현재의 비용유발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유지되는 한 국민의료비의 급속한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 인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소득계층간 의료이용의 격차가 더 커질 경우 문제는 더욱더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63 -
보건의료 문제는 제한된 일부 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불특정 다수와 관련되어 있으며, 문제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의료는 “어떤 사물·기관 등이 널리 일반 사회 전반에 이해관계나 영향을 미치는 성격·성질”로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관한 공통의 관심사로서 ‘규범적 의미의 공공성’을 갖는다.또한 보건의료는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시장 논리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적이라 할 수있다. 시장에 의한 상품의 거래와 자원 배분은 경쟁의 대칭성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이 된다. 이것을 보통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하는데, 보통 시장 실패는 경쟁의 불완전성, 공공재적인 재화의 성격, 외부 효과, 수요예측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건의료는 이와 같은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를 보면, 먼저, 보건의료 분야가 일반 부문과 달리 시장에서의 경쟁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면허제도 등과 같이 공급자의 독점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한 시장은 애초에 생각하기 어렵다. 둘째, 건강-질병 현상의 불확실성 내지 보건의료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보건의료에서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다.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확한 필요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다른 경제 분야와 달리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하기 어렵다.특히 시장에서 의료공급자는 이윤을 최적화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의료공급자 유발수요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선의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공급자를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더욱이 의료가 의료공급자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보건의료의 치명적 약점으로작용하게 된다.이러한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 또는 의료의 공공성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는 소비를 통해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장기적 편익을가져다주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서비스의 공급 자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선진 외국의 지배적 경향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위시한 일부 재원조달 기전 및 영리법인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 법적제도적 장치를 제외하면 전적으로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는 사적 의료체계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의료체계는 무정부적인 시장경쟁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보건의료의특성과 맞물려 가히 보건의료의 위기라 칭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보건의료의 위기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징후는 바로 공급 과잉이다. 급성기병상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있고, CT, MRI,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첨단 고가 장비의 보유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농촌으로 진출하기보다 구매력이 있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공급 과잉은 필수적인 의료의 과소 공급과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를 동반한다는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특히 현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항목이 의료공급자가 투자한 자본비용을 보전해주지 않고 경상비용만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의료공급자들은 자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진료강도를 강화하고 비급여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에 기초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이러한 진료강도 강- 64 -
화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무분별한 과잉 공급과 경쟁의 심화, 그리고 부적절한 진료 강도의 강화는 의사에 대한환자의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3차 의료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집중으로나타나고 있다. 의료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목표로 했던 의료전달체계도 유명무실해 졌고, 오히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3차 의료기관을 가기 위해 불편하게 거쳐야만 하는 진료 의뢰서 발급기관 정도로 인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건강의 불형평성 문제와 보건의료의 위기는 보건의료를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건의료의 구조적 취약성 내지 공공성의 부재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민간 중심의 소유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 실제 OECD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병상의 비중이 8.1%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부문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부문의 비중이 극히 취약한 실정이다.표 8. 주요 OECD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율(병상수 기준)구 분196 197 198 198 199 199 199 199 199 2000 0 0 5 0 5 7 8 9 0폴란드 - - - - - 99.9 99.8 99.8 99.8 99.2캐나다 - - 97.9 97.9 97.9 99.1 99.3 - - -영국 - - 98.5 97.6 96.8 95.7 95.7 95.7 95.8 -이탈리아 - 83.3 85.8 84.5 76.5 76.0 78.6 - 72.6 -멕시코 - - - - - 68.6 74.4 73.5 - 70.0프랑스 - - 64.2 68.0 64.8 64.6 64.8 64.8 64.8 64.9독일 55.9 54.6 52.4 50.9 51.0 49.9 48.5 - 46.5 46.4미국 24.3 23.9 21.4 18.9 18.4 33.7 - - - -일본 - 37.7 32.8 30.5 29.5 32.4 34.8 35.8 - 37.2한국 - - - - 14.6 10.2 9.7 9.0 - 8.1그런데 이러한 민간병원의 대다수가 개인 및 재벌자본의 소유와 지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심각성이 더 크다. 형식적인 설립 형태만 보면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는 병원이 많지만, 실제적인 지배구조를 보면 사적 성격이 매우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서구의 비영리 민간병원의 특성과 다른데, 서구의 민간병원은 자선적 성격이 강하고 대다수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적 역할을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민간병원은 전형적인 이윤극대화 모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65 -
2) 공급의 <strong>양극화</strong>와 질 저하또한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의원과 병원이 모두 외래와 입원 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 양자가 동일한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무정부성이 심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결과 경쟁력이 취약한 1차나 2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상방지향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재벌자본이 주도하는 병원의 대형화 추세는 의료이용 뿐 아니라 인력을 포함한 자원의 배분마저 왜곡시키는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더욱이 병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원은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어려워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서 이러한 경향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다. 소규모병원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과 동등한 시설을 갖추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규모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하여 시설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용연한을 지난 중고 CT가 소규모 병원에 확산되는 이유라 하겠다. 현재 소규모 병원을 중심으로 해상도가 낮아판독할 수 없는 필름이 상당수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소비자가 이를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또한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소규모 병원은 생존을 위해 생산비용의 절감이나 매출의 증가, 또는두 가지 모두를 부적절하게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라면 생산자의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 주권으로 인해 일정하게 제어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전이 작동하기 어려운 보건의료 시장에서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다수 병원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현실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46) .3)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소규모 병원은 구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상품 시장)과 의료인력 시장(노동 시장)에서 의원 및 대형병원과 열등한 지위에서 경쟁하게된다. 서비스 시장에서 소규모 병원은 의원의 본인부담금이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고, 대형병원보다 질적 수준이 낮아 품질 경쟁에서 불리하다. 인력 시장의 경우도 역시 대형병원의 평판과지위, 그리고 의원의 높은 소득 때문에 경쟁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는 ‘폐쇄형병원’과 ‘단과전문의의 개원’, 그리고 ‘병원과 의원의 기능 미분화’가 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데, 단과전문의가개원하려면 모든 진료 시설을 독자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일부 시범사업을 제외하면 병원의 시설을어떤 형태로든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렇듯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작동하고 의원, 병원, 대형병원 간에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되지 않아무분별하게 경쟁을 하게 되면, 막대한 양의 의료시설 및 의료 자원의 중복 투자와 낭비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외국의 어느 유형에 비해서도 한국의 의료전달체계가가장 비용유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러한 비용유발적인 의료전달체계 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매우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논리가지배하는 상황에서 의료의 수요가 많은 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된다. 또한 급성병상은 공급이 과잉인 반면, 장기병상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일들이46) 김용익. 공공성 부여를 통한 중소병원 육성지원 연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03.- 66 -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병상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2001년 현재 급성기병상은 OECD 평균에 비해 과잉인 반면, 장기요양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OECD655.2인구천명당4323.14.010.90.70.40급성 정신 장기요양그림 22.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병상공급현황자료 : OECD Health Data 2002그런데 급성기병상의 공급 과잉은 최소한 도시 지역에 한정된 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촌지역의료기관의 병상 규모와 질적 수준을 고려하면, 즉 ‘질적 수준을 보정하여(quality-adjusted)’ 의료자원의 분포를 다시 계산해 보면 대다수 농촌지역은 사실상의 공급 부족상태에 처해 있다. 이 과정에서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대체 소비하게 됨으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이 오히려 의료를 이용하는 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사실 시장의 논리로 보면, 농촌 지역은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적절한 규모의 병원이 성립되기 어렵다.하지만, 자원의 균형적 배분과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가는 일정한 비효율을 감수하더라도농촌지역에 자원 공급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WHO가 발간한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에서 사적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 의료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 체코, 룩셈부르크이었고,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62.3%), 멕시코(59.1%), 미국(55.9%)의 순이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사적 의료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치 27.4%보다 두 배이상 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곧 공공부문의 의료비지출이 그만큼 낮아 보건의료부문에 대한정부정책의 영향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며, 아울러 재정 시스템이 소득 역진적임을 의미한 결과이기도 하다.- 67 -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70.060.050.040.030.020.010.00.0그리스네델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멕시코미국벨기에스웨덴스위스스페인아일랜드아이슬란드영국호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일본체코캐나다터키포르투갈폴란드프랑스핀란드한국헝가리사적 의료비 /국민의료비 (%)멕시코미국한국영국그림 3. 사적 의료비 비율2001년 보건복지부가 OECD에 의뢰하여 실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더라도, 높은 사적 의료비 부담비율은 첫째, 본인부담금 지불이 지불능력과 관련이 없고, 둘째, 본인부담금 면제 혹은 감면이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수급권자에만 적용되며, 셋째, 고액진료비가 발생하여도 본인부담금 상한선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매우 소득 역진적이라고 지적하고있다.본인부담금이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부담금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남용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자는 것인데, 본인부담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없을 경우 소비자는 의료서비스를 남용할 가능성이있다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만약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본인부담금이 없는 영국이 한국보다 외래의 방문일수가 적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의료의 남용이 발생하는 것은 공급자 요인 등 다른 제도적 요인이 지배적인 변수이지 본인부담금의 존재 유무는 매우부차적인 변수일 수밖에 없다. 만약 낮은 본인부담금이나 무상의료에 의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치의 등록제나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된다면 도덕적 해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없다.이와 달리 본인부담금의 존재는 훨씬 큰 부작용을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의료이용의 재정적 장벽이 높아져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특히 예방서비스와 같이 의학적 필요성은 높으나 소비자가 필요성을 덜 느끼는 서비스가 더 큰 영향을 받게 됨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소득 탄력적이기때문에 저소득층에서 이런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소득층은 비록 소액진료비라 하더라도 진료비의 본인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울 수 있고, 실제 병에 걸려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계는 쉽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strong>빈곤과</strong>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건강보험의 과다한 본인부담 문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항목의 존재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비급여 항목이 공급자의 유발수요에 의하여 급속하게 팽창되는 양- 68 -
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비급여의 확대 자체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정부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부분에 자원이 집중되는 등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비급여의 확대 자체가 직접적인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가정경제 파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실정이다.2002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율은 입원이 34%, 외래가 64%로 전체 총진료비의 47.6%에 이르고 있다. 결국 진료비의 50%를 조금 넘는 부분만 건강보험이 보장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보장성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안전망의 구실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선언에 불과하다. 더욱이 직접적인 진료비 부담 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휴업일수 또는 손실일수를 보장해주기 위한 상병수당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저소득계층에게 사치일 뿐이며, 건강보험의 혜택은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살펴본 의료이용에 있어서 소득계층간 격차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 단면이라 하겠다.2)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진료비지불제도의사나 병원에 진료비를 어떻게 지불하느냐는 문제는 건강보험 또는 의료제도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현행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의료비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서비스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가 아닌 의사이다. 환자는 의사에 비해 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때 의사는 자신의 수입을 최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능한 많은 환자를 유인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재진을 권유하거나 환자를 비용이 많이 드는병원으로 의뢰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이처럼 어떠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설정되느냐에 따라 의료공급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기도 한다. 따라서 진료비지불제도는 의료제도의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등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앞서 이야기한대로 우리나라는 진료비지불제도로 수가 항목이 극단적으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고 있다. 수가 항목이 이렇게 세분화되면 건강보험은 개개의 진료 행위를 일일이 심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병원 또는 의사들의진료행위에 대해 보험자나 심사평가원이 일일이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까지 심사를 둘러싸고 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간에 벌어져왔던 갈등과 충돌의 주요한 원인이 바로 이러한 행위별수가제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행위별수가제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료량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을 막기 어려운 보건의료시장의 특성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진료비지불제도라 할 수 있다. 일부 의료기술의 발전에 유리한 측면을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과잉진료와 자원분배의 왜곡, 그리고 의료비 증가를 촉진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러한 행위별수가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차의료에 적합한 방식인 인두제, 보험자와 의료제공자간에 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고 배분하는 방식인 총액계약제 등 다양한 진료비지불제도가 존재한다.모든 진료비지불제도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진료비지불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문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행위별수가제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불제도의 개편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69 -
무상의료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 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도입 방안 역시 적극적 도입방안과 소극적 도입방안으로 구분될 수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할 경우 무상의료의 도입이란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의 도입방안이란 경제적 지원 또는 재원조달(건강보험, 의료급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공공적 개편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 방안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그렇지 않고 재원조달 측면으로 좁혀서 바라볼 경우 무상의료의 도입 방안은 보건의료의 이용에서경제적 장벽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 또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상의료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재원조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총체적인 문제점에서 제기된다는 점에서 광의의 개념으로 무상의료를 이해하고 적극적도입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는 진료비의 본인부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 방향으로 도입방안을 만드는 것이요구된다. 1)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는 미용, 성형, 상급병실료 등 일부 법정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비급여의 급여화를 의미한다.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정부/건강보험의 수가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서비스가 의료기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 확대는 의료기관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이유로 미충족의료로 남아 있었던 의료서비스의 욕구가 수요로 전환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자에게반드시 부정적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반면, 비급여의 폐지는 공적으로 조달되는 보험재정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의료체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비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형평성을 개선하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 <strong>양극화</strong> 문제를줄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부 법정비급여 항목을 제외한모든 비급여 항목을 시급하게 급여화해야 할 것이다.2) 본인부담금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무상의료의 실현현재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본인부담금은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초래하는핵심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비급여- 70 -
의 급여화가 이루어진다면 현행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진료비가 발생하는 고위험군 환자의 본인부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본인부담금제도가 남아 있는 한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해결되기 어렵고, 소액 진료비더라도 의료이용의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제도의 폐지를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한 2001년도 연구를 보더라도 저소득층일수록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영․유아 및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제도를 폐지해나가도록 해야 한다.이와 같이 건강보험의 저소득계층(차상위계층)에 대해 무상의료가 실현되고, 보험료의 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개선되면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별도로 운영될 필요가 없어지게된다. 잔여복지적 성격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체계에 편입시키고 보편적이고 단일한 의료보장체계를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3) 상병수당진료비에 대한 직접적인 부담이 사라지게 되면,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하는 가계 소득의 상실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을 신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계 소득의 상실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 특히 저소득계층일수록 그러한 경향이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상병수당의 신설이 필요하다.또한 상병수당의 도입은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strong>빈곤과</strong> 불건강이 악순환의 고리를형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빈곤의 <strong>양극화</strong> 해소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보인다. 1) 행위별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지금까지 DRG 포괄수가제도가 논의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오랫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압력에 밀려 DRG 포괄수가제도가 임의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긍정적 효과는 발현되지 못하고 의료비용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파행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DRG 포괄수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제도에 대한 의료공급자의 오해와 반감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진료비지불제도로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총액계약제란 주어진 기간 동안 의료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약품의 총비용을 사전에 미리 계약하여 지불하는 제도로서,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총액계약제가 도입되려면, 우선적으로 공급자에 대한 사후 모니티링체계 및 진료의 적정성 평가를포함한 의료의 질 평가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달성되면 가능한 공급자(치과,한방)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71 -
2)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의 신설이윤동기의 완화를 목적으로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병상수급 조절기금」은민간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병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될수 있으며, 민간병원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는 데에 투자될 수 있다 47) .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료보험은 경상비용만을 지불하고, 병원의 자본적 투자비용은 별도의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는 데에 민간 및 공공병원 간에 차이가 없다.민간기관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기금에서 재원을 공급받기를 원하는 병원은 공공성강화 대책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민간기관에 공공자금을 지원하는 타당성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1) 대안으로서 공공의료시장실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공공의료의 강화는 유일한 해결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존재하는 공공병원을 포함하여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병원(patient agency)이 전무한 상황에서 공공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성실한 공급자로서 공공병원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공공의료가 대안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금의 공공병원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한다. 즉, 공공병원본래의 기능인 환자진료와 더불어 보건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성을 추구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이를위해 전제 조건으로서 민간병원에 뒤지지 않는 현대적인 시설과 우수한 인력,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2) 서비스공급체계의 개편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을 50% 이상 확충함과 동시에 의료비 낭비와 불평등한 건강문제를 낳은 요인들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서비스제공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먼저, 1/2/3차 기능을 분화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그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둘째, 시설, 인력 및 자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셋째, 과잉 공급되어 있는 급성 병상을 만성 병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넷째, 적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성기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적정 규모를 갖도록 한다.다섯째, 치료 위주의 서비스공급체계에서 예방과 보건관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공급체계로 전환해47) 김용익. 보건의료공급체계와 보건의료자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2003.- 72 -
나가야 한다.마지막으로 민간 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이 강화되어 법 형식적인 비영리성이 아니라 내용적이고 실질적인 비영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특히, 소규모 중소병원 중 상당수를 장기요양병원으로 전환함으로서 급성기병상의 공급과잉과 장기요양병상의 공급부족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공급체계의 공공적 개편 과정에서의원-지역중심(거점)병원-3차병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진료비낭비와 질 저하 요인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본인부담폐지재원조달체계개편1단계(2005년~2007년) 2단계(2008년~2010년) 3단계(2011년~2013년)1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1건강보험 하위 30% 본인부 1본인부담 전면폐지(본인부담상한제 작동)담 폐지2상병수당의 제공2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폐 270세 이상 본인부담 폐지지3차상위계층(건강보험10%) 본인부담 폐지3장애인 본인부담 폐지 및하위 포괄적 재활급여 제공4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및4영유아(5세 미만)의 본인부담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폐지1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 계약 1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통 1산재보험과실시2서비스적정성평가 도입3차상위계층 보험료면제4의약품등재 positive list 도입 3약가결정구조 변화및 약가계약제5공공부문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5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실시부담율 30%)6장기요양수가 개발, 도입7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부담율 40%)합적 운영통합적 운영2필수의약품 지정 및 특허권 2의원, 병원 순서로 총액계제한약제 실시4치과, 한방 총액계약제 실시 용 실시건강보험의3보험료 부담의 누진제 적4단계(2014년~)의료이용측면에서 포괄적무상의료 실현공적 재원조달기전의 확립- 73 -
1도시형보건지소 시/구의 1개 동 1동별 1개소씩 60% 설치 1동별 1개소씩 설치시범 설치2시군구별 1개소씩 60% 설 2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246개 지역중심공공병원 300병상 치3시군구별 1개소씩 설치규모 확장, 시군구별 1개소씩 3시군구별 1개소씩 60% 설 4공공제약회사 설립30% 설치치3민간중소병원 매입 통한 공공요 4공공의료전달체계공급체양병원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 확립계치5민간부문 자본비용개편4지역병상총량제 실시 및 병상 제공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공급량 통제5의료기관서비스평가6의료인력 공급 공공화 추진공적기구 (의과대학 무상교육 실시)이관 및 전면 실시6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정부 이관1공공의료기관 관리 일원화 1지역보건의료위원회 구성 1지역보건의료위원회에 지행정,관 2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부분 2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역 공공의료기관의 기획 및리체계 개정전면 개정평가 권한 위임개편 3공공의료에 관한 법, 지역보건법 3의료법 개정2사회보장청 신설개정공공부문주도(50%이상)의보건의료체계구축참여와 계획이전제된지방분권형관리운영체계구축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재정을 매년 급여비로 지출되는 경상비용과 공공병원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시설비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단계의 경우 경상비용으로 연간 2조951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비용으로 7,441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9. 1단계의 연간 소요 재정 추계(2006년 기준)1)구분 항목 소요 재정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급여율 30%) 27,963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 폐지 14,305차상위계층(건강보험 하위 10%) 본인부담 폐지 2) 8,875영유아(5세 미만)의 본인부담 폐지 10,256경상비용 서비스 적정성 평가의 도입 3) -12,642차상위계층 보험료 면제 4) 1,860의약품의 positive list 도입 및 약가계약제 5) -15,830공공부문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6) -5,277소계 29,510도시형보건지소 시군구별 시범 설치 7) 659시설비용지역중심공공병원 시군구별 1개씩 30% 설치 8)(46개 공공병원 확장)5,549민간중소병원 매입을 통한 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 1개씩 30% 설치 9) 1,233소계 7,441계 36,951- 74 -
1) 2003년 진료비 통계에서 7.7% 인상률 적용 / 2) 2002년 자료 이용 / 3) 비급여포함하여 입원, 외래 진료비의5%를 절감한다고 가정함 / 4) 하위 1분위의 총보험료 분율을 2.19%로 가정함 / 5) 약품비용의 15%를 절감한다고가정함 / 6) 공공부문 30%, 총진료비의 5% 절감을 가정함 / 7) 247개소 설치, 1개소 당 8억, 3년 분할 / 8) 46개병원 리모델링 비용 1개소 당 87억 원, 28개 병원 1개소 당 450억원, 3년 분할 / 9) 매입 또는 신축 1개 기관 당50억 원, 3년 분할무상의료 2단계가 실현되려면 경상비용으로 연간 3조7904억원, 시설비용으로 1조410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2단계의 경상비용은 1단계의 경상비용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의미한다.표 10. 2단계의 연간 소요 재정 추계(2006년 기준)1)구분 항목 소요 재정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동일 급여율 적용 38,522건강보험 하위 30% 본인부담 폐지 10,80770세 이상 본인부담 폐지 13,310장애인 본인부담 폐지 및 포괄적 재활급여 제공 1,000경상비용 본인부담 상한선 인하 및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1,000필수의약품 지정 및 특허권 제한 2) -15,830치과 부문, 한방부문 총액계약제 실시 3)(공공부문 확대 포함)-10,905소계 37,904도시형보건지소 동별로 1개소씩 60% 설치 4) 1,741시설비용지역중심공공병원 시군구별로 1개씩 60% 설치 5) 11,130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로 1개 이상씩 60% 설치 6) 1,237소계 14,108계 52,0121) 2003년 진료비 통계에서 7.7% 인상률 적용 / 2) 약품비용의 15%를 절감한다고 가정함 / 3) 공공부문 50%로 확대, 치과와 한방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1%, 진료비의 10% 절감을 가정함 / 4) 1500개 동에서 60% 설치 가정, 1개소 당 8억, 3년 분할 / 5) 72개 병원 신축, 병원 1개소 당 450억원, 3년 분할 / 6) 72개 병원 신축 또는 매입,1개 기관 당 50억 원, 3년 분할무상의료 3단계가 실행되려면 경상비용으로 연간 3조9214억 원이 필요하고, 시설비용으로 연간 1조806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75 -
표 11. 3단계의 연간 소요 재정 추계(2006년 기준)1)구분 항목 소요 재정본인부담 전면 폐지 55,710경상비용상병수당의 제공 2) 18,681의원,병원 총액계약제 실시 3) -35,177소계 39,214동별로 1개소씩 설치 1,600시설비용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 14,820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 1,647소계 18,067계 57,2811) 2003년 진료비 통계에서 7.7% 인상률 적용 / 2) 2002년 입원내원일수를 휴업일수로 가정, 일당 6만원에 70% 급여율 가정 / 3) 총액계약제 확대에 따라 진료비 20% 절감을 가정함경상비용의 경우 보험료의 가입자 분담율을 1단계에서 40%로 적용하고 2단계에서 30%로 적용할경우 단계별 연간 소요 재정의 각 주체별 분담액을 살펴보면, 2006년 기준으로 직장 및 지역의 가입자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사업주가 1단계에서 연간 2조1683억 원, 2단계에서 연간 5조433억원, 3단계에서 연간 6조6903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1단계에서 연간 1조4456억 원, 2단계에서 3조3622억 원, 3단계에서 4조4602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설비용은 정부예산을 통하여 1단계에서 연간 7,441억 원, 2단계에서 연간 1조4108억 원, 3단계에서 연간 1조8067억 원이 투입되어야한다.표 12. 각 단계별 연간 소요 재정 및 재정 분담 계획(2006년 기준)경상비용시설비용구분 연간 소요재정 정부예산 사업주부담 개인부담1단계 29,510 14,456 21,683 (6,629)2단계(누적) 67,414 33,622 50,433 (16,641)3단계(누적) 106,628 44,602 66,903 (4,877)1단계 7,441 7,4412단계 14,108 14,1083단계 18,067 18,067 1) 의료이용자, 국민(소비자) 측면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의료이용이 필요한 국민들이 경제적인 고려 없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준이 획기적으로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무상의료가 도입되면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의료보험을 들어야 했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의 규모가 한 해 5-6조원에 이를 정도로 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무상의료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 76 -
를 말끔하게 해소해주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까지 무상의료의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보험료 부담만 증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무상의료의 도입에따른 긍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조직화하는 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또한 무상의료의 도입을 지역주민(국민)의 요구로 정식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문제의 대안이 도출될수 있도록 지역운동과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2) 국민의료비 측면앞서 살펴본 바대로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일정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GDP로 표현되는 총 사회적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민간 부문에 대하여 합리적 조절이 강화되고, 재원조달 기전을 공공적으로 개편한다면, 비용유발적인현 의료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 확실하다.현 체제에 대한 별다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년 7.8%씩 병상이 증가하고, 매년 7.7%씩총진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2014년에 이르러 한 해에 의료 부문에 투여되는 사회적 부담이 68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공병상이 확대되고 민간병상의 증가가 단계적으로 억제되면, 또한 의료체계의 거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등 무상의료 도입에 따라 국민의료비의 상승이 둔화된다면2014년에 약 16조원의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렇듯 무상의료를 도입하면 국민 경제의 거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확대의 부담감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 민간 부문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공세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료비가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비용유발적인 관계로 고용 창출이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긍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함께 알려나가야 한다. 결국 무상의료의 도입이 현재 존재하는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의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해나가야 한다.800,000700,000600,000억원500,000400,000300,000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현 체제 유지무상의료 도입그림 4. 무상의료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부담 추정1)1) 1단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2008년부터 총진료비의 3%, 6%, 9%씩 순차적으로 절감된다고 가정하여추계함.- 77 -
율임을 강조해야 한다. 더욱이 건강보험료에서 자본측의 분담은 엄밀하게 말해 자본측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차피 사업주는 사회보험료를 감안하여 임금 계약을 맺기 때문에 사회보험료는 개별 임금이 아닌 노동자의 집합적인 사회임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결국 보험료 분담율 상승은 단기적으로 자본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개별 임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따라서 분담율 증가에 대한 자본측의 반대는 다른 정치적 의미가 존재한다. 개별 임금에 비해 사회임금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비정규를 대별되는 자본측의 노동 분할 정책에 주요한 물리적 힘이 상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총자본은 사회임금의 강화에 강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어떻게 보면 분담율이 문제가 아니라 총보험료의 순증가가 자본측에 더 큰 반발요인일지 모르겠다.또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는 보험자본의 이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예상된다.사회임금의 강화는 노동자의 단결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확보하는 중요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 따라서 무상의료 도입에 대한 자본측의 반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 하겠다.향후 무상의료 도입을 둘러싼 자본측과 민주노동당 및 진보진영간의 대립은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도 폐지를 둘러싸고 일차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당연지정제도에 대한 총자본과 정부의 공세에 대해서 제도의 유지라는 수세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유지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정치 지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도입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필요하며, 이러한 투쟁이 민간의료보험 및 영리법인 도입 반대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 것인가?‘무상의료’ 쟁취 투쟁! 그것이 바로 질문에 대한 해답이자 방법이다.- 79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의료:토론1토론의 글이상이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이상이와 김철웅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건강보험대상자 및 의료급여 대상자)의 암 발생율과 치명율(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장 낮은 소득계층은 가장 높은 소득계층보다 인구 10만명당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소득계층 대비 낮은 소득계층의 암 발생 위험이 남자가 1.65배, 여자가 1.43배인 것으로 나타났음.○ 치명률 분석에서도 남자의 경우, 전체 암 환자 중 소득 1계층(상위 2구간)에 비해 소득 2계층을포함한 모든 계층에서 사망할 위험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특히 5계층(하위 2구간)에서 사망할 위험이 2.06배나 되었음. 주요 악성종양별로 보면, 5계층(하위 2구간)의 상대위험비가 간암 2.32배, 위암 2.29배, 전립선암 2.00배로 나타났음.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전체 암 환자의 소득1계층(상위2구간) 대비 기타 소득계층간 사망위험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5계층(하위2구간)에서 상대적 사망위험비가 1.49배로 나타났음. 유방암에서 소득 1계층 대비상대위험비가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3.09배, 5계층에서 2.13배였으며, 자궁경부암도 소득 1계층대비 의료급여 대상자의 상대위험비가 2.16배였음. ○ 이상이 등(2003)의 연구에서, 암 입원 의료의 필요가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제주도 내의료기관에서 암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세하게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나, 제주도 외의료기관에서 암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에 크게 불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여, 결국 제주도민이 이용한 전체(제주도 내 + 제주도 외 의료기관) 암 입원 의료이용은 저소득 계층에게 불리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참조)- 80 -
진료비누적비율(%)1009080706050403020100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인구누적비율(%)전체의료이용제주도내제주도외대각선그림. 소득계층별 암 진료비의 누적곡선(지역건강보험 대상 제주도민)○ 발표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인구의 소득계층간 의료이용 불평등은 장차 큰 사회적 문제가될 것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임. 그러나 이것은 의료 자체적 접근만으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음. 사회구조적 요인이 지배적인 영향요인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의료이용의 불형평(Inequity)’만이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즉, 의료필요가 있는 국민이라면, 그의 직업과 소득계층, 교육수준,거주지역,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오늘의 발표와 토론의 취지는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원래 일차의료는 축구경기장의 게이트키퍼 역할임. 일차의료 의사는 국민이 건강과 질병의 문제로 최초 접촉하는 곳으로 간단한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질병예방, 상담. 건강위험의 정기적 평가, 왕진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주민과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치의사임.○ 이 경우, 당연히 치료보다는 예방과 건강증진이 중시되며, 이는 의료제공체계의 비용-효과를 높이는 효율적인 것임.- 81 -
○ 우리나라는 일차의료가 과잉 투입된 자원의 낭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질병의 치료에 국한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민의 기대와 보건학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은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면서 입원병상을소유(총 병상의 약 30%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경우임.☞ 현행 일차의료의 이러한 그대로 둔 채, 일차의료를 강화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없음. 일차의료를 본래의 모습과 기능을 갖도록 주치의제도를 확립하는 방법만이 국민을 위한의미 있는 개혁조치임. ○ 원래 의료전달체계는 1차(의원, 동네수준) - 2차(종합병원,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 - 3차(대학병원, 광역수준)로 지역화 되어 있어야 함.○ 1차 의료는 의료필요는 크나 간단한 질병을 다루는 곳이며, 반대로 3차 의료는 의료필요는 적으나 고난도의 시술과 의료기술을 요하는 질병을 다루는 곳임. 2차는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짐.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적 전달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1, 2, 3차의료기관 상호간에 무질서한 낭비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의료기관의 과잉은 2차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2차 수준의 환자를돌보고 있음. 또, 2차는 3차에 대항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것임.☞ 현재, 3차 의료 병상이 쏟아지고 있음. 정부의 병상정책 부재가 불러온 비극적 상황임. 상황이이렇게 되니까, 3단계 의료전달체계를 포기하고 2단계로 전환하자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음. 이논리는 보건의료의 지역화 개념을 포기한 것으로 국가 전체적인 비효율을 양산하는 지극히 잘못된 것임. ○ 발표자는 무상의료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전자를 재정체계를 포함한 의료제도의전면적 공공 개편으로, 후자를 재정체계의 무상 개편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구조 개혁적 관점에서 볼 때, 실제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임. 재정체계와의료제공체계는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임. 즉,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상호관계를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전체적 조망(Whole Picture)을 가지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함.- 82 -
재정투입공공재원(54.4%)건강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 등민간재원(45.6%)가계지출민간보험 등의료제공체계의료재정체계누수낭비재정불안비효율국민의료비지출의 급증(산 출)그림. 의료제공체계와 재정체계의 개념적 관계 모형도○ 결국은 국가재정 투입의 정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이며,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임.☞ 결국, 무상의료 이념의 실현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고려할 것이라면, 의료이용의 대상이 되는 질병 중 중대질병을 상정하고, 이를 우선순위 질병으로 삼아 전체 국민에게 보편적 혜택을 줌으로써 무상의료의 실체적 이념을 국민의 피부에 긍정적으로 와 닿게 하는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환자의 의료이용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부분은 56%이며, 법정 본인부담이 22%여서, 이를 합한 건강보험 급여영역은 78%임. 의료비의 22% 영역에대해서는 아무도 그 정확한 규모와 내용,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질을 알고 있지 못함.- 83 -
압력(가격 통제)A.건강보험 부담분(56%)C.비급여영역(22%)B.법정 본인부담(22%)A+B : 건강보험 급여 영역C :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그림. 건강보험제도의 각기 부담영역과 풍선효과의 개념도○ 비급여 영역을 없앰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들은 다음과 같음.- 국민의료비의 통제 및 예측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신뢰성 제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모니터링이 가능-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낮아져 형평성 제고-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 서민가계의 파탄 방지☞ 무상의료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경과해야 할 지점이 바로 비급여의 폐해를 없애는 것임.이 부분은 양식이 있는 한, 건전보수 세력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영역임. ○ 발표자의 주장대로, 본인부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임. 그러나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측의 주장 또한 타당한 부분이 있음. 그러므로본인부담의 축소 또는 폐지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잘 모색해야 함.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의사유인수요가 지배적인 왜곡된 의료시장 구조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84 -
○ 그러므로 의료제공체계의 공공성, 보수지불방식의 개편 등 큰 틀에서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전에는 탕감 또는 본인부담 폐지보다는 본인부담의 축소, 또는 중대질병이나 필수 입원 등에서부터 일부 계층에 국한한 우선적인 본인부담 탕감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85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의료:토론2(별첨)토론자 : 유원섭(을지의대 교수)- 86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의료:토론3(별첨)토론자 : 김창보(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87 -
- 88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노동:토론1(별첨)토론자 : 주진우(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 89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노동:토론2(별첨)토론자 : 황인철(경총 사회정책팀장)- 90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노동:토론3(별첨)토론자 : 정태면(노동부 고용정책과장)- 91 -
UN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 및 중등도 장애인의 대략2/3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이들은 빈민 중에서도 최빈층에 속하며, 대중교통 수단과 건강서비스가 열악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교육, 고용 및 기타 소득기회에 충분히 접근할수 없는 경우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집단이다(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2004). 이처럼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빈곤에 직면할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어렵지 않다.장애인들이 지니는 가장 우선적인 욕구가 경제적 문제와 소득보장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널리 알려진 바이다. 나라마다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것도 이 때문이며, 우리나라도 이 점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소득보장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명목에 걸맞은 기능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근자에 초미의 관심사로 다뤄지고 있는 것이 무갹출(non-contributory) 장애연금제도이다.장애인계를 비롯한 다각층의 여망을 반영하여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자들이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선거 당시의 분위기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제도화가 가시화 될 듯도 하였으나, 노 정권 출범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오히려 후퇴하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기획예산처가 노 대통령에 대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연금제 도입을 이견 조정 후 추진할 공약으로 분류했다는 지난해의 보도(「에이블뉴스」, 2004. 10. 21.)가 우선 그 하나의 증거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건에 대한 집중연구를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상황이나, 예정된 보고시기를넘기면서까지 공식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점은 그만큼 이 문제가 민감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가 하면 올해 들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이거나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그런데, 발제자는 이 제도가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불가결한 최선의 제도인가에 대해 한 번쯤 반문해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른바 선행 복지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란- 92 -
사실이 다양한 대안적 제도의 수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하튼 근자의 이러한 동향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빈곤에 빠질 우려가 큰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할 만하다.이와 같은 논의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지금까지의 국내 관련 연구들 사이에 소득보장제도의 향방과관련하여 첨예하게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는 논쟁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소득보장의 큰 원칙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본 발제도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듯하다. 특히, 정책상의 세세한 수리적 분석을 포함한 기술적 영역은 발제자의 능력을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발제의 주제인 장애인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다룰 수밖에 없겠다.발제자는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궁극적 지향은 이미 널리 일컬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의 실현에 두어져야 한다고 전제한다. 독립생활의 이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되, 장애로 인한 부가적 욕구의 충족이 필요함을 일깨워준다.그러면서 장애의 생리학적 측면인 손상(impairment)이 장애인의 삶의 기회(life chances)를 결정짓는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생리적 특성이 결코 운명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Our biology is notour destiny.)”는 표현(Morris, 2004)이 독립생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이러한 전제 위에 장애인 빈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설정함으로써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이 취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제는 이러한 원칙들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쟁점들을 제기하면서 대안 찾기를 위한 논의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인 빈곤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혹은 시각에 따라 달라진다.장애인 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개별적 모델이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회적 모델(socialmodel)이 대두한 이래로, 이 모델에 근거를 둔 국제적인 장애인 단체활동과 권익운동, 개별 국가의입법, 학교의 교육, 각종 연구 등이 주축을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Gabel and Peters,2004: 585). 손상(impairment)이라는 의학적․해부학적 현상을 문제발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개인적 적응과 재활에 초점을 맞추었던 종래의 개별적 모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모델은분명 장애인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었었다. 장애인의 문제가 개인적 결함보다는 사회적 저해요인에 의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고, 현실이 그러한 설명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기 때문이다.그런데, 근자에 들어 다시 이러한 사회적 모델의 한계에 착안하면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해보려는움직임들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두되고 있다. 일종의 포스트 사회적 모델이라 할 만한 이러한 움직임들의 예로서는 ‘정치행정 모델’을 제시한 이성규(2003), 저항이론(resistance theories)을 제시하는게이블과 피터스(Gable and Peters, 2004), 절충적인 사회관계적 이해(social relationalunderstanding)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토마스(Thomas, 2004)의 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연구(disability study)의 패러다임이 다중적으로 존재함을 밝히면서 이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 분석에 적용한 이동석(2004)의 연구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정향 분석에 적용한 김정우․박경수(2005)의연구도 이러한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겠다.논자들마다 모델, 이론, 패러다임 등의 용어에 대한 의미부여가 상이해서 이상의 논의들을 하나의설명 틀 속에서 명료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며, 이 글의 주된 목적도 아니다. 다만 본 발제자가 장애인의 <strong>빈곤과</strong> 관련 정책에 관한 지금의 논의를 위해서 선택한 시각과 그 이유만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발제자는 토마스의 절충적 관점인 사회관계적 시각을 채용하고자 한다.- 93 -
토마스는 사회관계적 시각의 채택이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그것이 사회적 모델을낳은 이후 사장되었던 것을 재현(revival)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사회관계적 시각의 핵심은 장애인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나 제약(restrictions)이 사회적 장벽(social barrier)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손상 그 자체에 의해서도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있다고 보는 대표적인 논자인 셰익스피어와 왓슨(Shakespeare and Watson)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손상의 의미가 단순히 생물학적(biological) 현상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손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나 손상에관한 담론들이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상 자체가 대단히 사회적 의미를지닌다는 것이다. 손상과 장애(disability)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장애는 복합적인 생리-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Thomas, 2004:570-574).어떤 의미에서 장애 문제를 다루는 패러다임이나 시각에 획기적인 것이란 따로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최소한 전인격적 장애인의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보장-즉, 독립생활의 실현-을 당위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공유한다면, 여타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접근 방법에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 있을 뿐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발제는 장애인 문제, 특히 장애인의 빈곤현상을 손상이라는 생리해부학적요인과 배제를 포함하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비롯되는 현상으로 파악한다.장애가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를 손상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예로서 바타비아와 뷸로리에(Batavia and Beaulaurier)의 설명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취약성을보이게 되는 주된 이유를 1기능상의 제약과 연관되는 소득능력(earning capacity)의 제한, 2이런 기능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질적 비용(substantial costs), 3재정적 충격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high susceptibility) 등을 꼽는다. 말하자면, 장애인들 중에는 제한된 소득능력으로 인하여 빈곤선에 근접한 소득으로 여유 없이 생활하는 나머지, 수시로 부딪힐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없어 빈곤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Batavia and Beaulaurier, 2001: 140).이와 같이 빈곤이란 일차적으로 경제적 취약성, 곧 불충분한 소득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지만, 이것을 단지 소득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나 권력부재(powerless)와 같은 경제외적 속성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Yeo, 2001: 9). 장애인의 빈곤을 이처럼 사회적 배제나 권력부재 현상과 연관시켜 파악하는 것이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장애인 빈곤 문제에 접근하는 예가 된다.빈곤현상과 그것을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은 순환적 인과연쇄를 이룬다. 장애의 두 측면-손상과사회적 요인-과 빈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악순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장애아동은 비장에 아동에 비해 빈곤하게 살 확률이 크고, 부모 중에서 최소한 한 쪽이 장애를 가진 경우그 자녀가 빈곤해질 가능성은 건강한 부모 아래에서 성장하는 자녀의 약 두 배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Sayce and O'Brien, 2004: 667). 그리고 레베카 여(Rebecca Yeo, 2001)는 장애인의 만성적 빈곤현상에 주목하면서,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 및 빈곤을 악순환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빈곤이 만성화되는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국제적인 발전과 빈곤퇴치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국 정부의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strong>빈곤과</strong> 장애의 악순환 과정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DFID, 2000).- 94 -
[그림 15]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출처: DFID, 2000.이상과 같은 논의에 근거하여 본 발제자는 장애인 빈곤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차별과 배제라는 사회적 요인과 소득능력의 제한 및 부가적 지출이라는 손상 관련 요인으로 압축하여 다루고자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의식이나 태도의 측면과 함께 제도의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차별(discrimination)”이라 할 때에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불리하게 처우를 하거나 불리한결과를 야기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태도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차별은 주류가 비주류에 대해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다수가 소수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다. 또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한다(감정기․임은애, 2005 재인용).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혹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식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특정사회집단이 보통 시민에게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제지하기도 한다. 결국 차별과 배제는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차별은 공개적 혹은 암묵리에 모종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Bromley and Curtice,2003).장애인차별(disablism)은 이상과 같은 일반적 의미의 차별적 행위나 태도의 대상을 장애인으로 설정한 개념이다. 장애인 차별은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폭넓은 형태를 띠고 이루어진다. 미국의 ADA는장애인들이 부딪히는 차별의 다양한 형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즉, 공공연하고 의도적인 배제(exclusion), 건축․교통․통신 등의 장벽에서 비롯되는 차별적 결과, 과잉 보호적 규칙과 정책, 기존의설비나 실무를 적절히 수정하지 않는 일, 배제적인 자격기준이나 요건, 분리(segregation), 서비스․프- 95 -
로그램․활동․혜택․직업․기타의 기회들을 감축시키는 일 등을 모두 차별의 구체적인 양상으로 적시함으로써(ADA Sec. 2 (a)(5)), 간접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서 설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의 범주를 보면, 첫째로 노동,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장애인을 구별하는 것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구별한다는 것은 배제하지는 않지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장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이들을 소외시키는 것도 차별로 본다. 넷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상이한 취급을 하지 않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장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간접차별로 보고 있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차별로 정의되고 있다(이석형, 2002).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적대적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대적 태도를 은폐하거나왜곡한 채 그것과 상반되는 호의적 형태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적대적 장애인차별(hostiledisablism)은 통상적인 장애인차별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여 멸시하고, 이들을 혐오 혹은 기피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며, 장애인에대한 사회적 투자가 소모적이라 보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말한다. 반면에 호의적 장애인차별(benevolent disablism)이란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낮추어 평가하되 이들을 ‘보호’해야 할대상으로 인식하고, 주류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며, 이들에대한 최소한의 투자의 필요성을 시혜적이고 온정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태도”이다(감정기․임은애,2005). 후자를 차별로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태도 역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우열의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이자 인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격리와 열등한 생활조건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배제 현상도 이러한 차별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사회적 모델이 특히 강조하는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다양한 장벽들에 의해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들 중에는 위에서 언급한 태도적 장벽(차별적 태도) 외에 제도적 및 환경적 장벽을 상정할 수 있다. 제도적 장벽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거나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제도가 결여되어 있음을 말한다. 환경적 장벽이란 접근이 불가능한 건물, 교통체계 혹은 정보체계 등을 가리킨다(Thomas, 2004).요컨대, 이상과 같은 차별과 배제가 장애인의 경제적 취약성에 작용하여 빈곤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거나 제거해 나가는 데에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부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extraordinary costs of living)이 재정적 취약성을 초래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장애인에게만 필요한 특수품목 관련 비용(disability-created costs)이 있는가 하면, 비장애인과 공통적으로 소요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지출규모가 큰 일반(혹은 공통)품목 관련비용(disability-enhanced costs)이 있다(이승신, 2003 재인용).전자에는 보장구비, 특수 장치를 한 자가용 유지비, 주택 개조비, 가사 서비스 이용비용, 기능보강을위한 치료비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의료비, 교통비, 사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일면은 이러한 추가적 비용부담을 보전하는 데에 기울여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장애인이 소득능력(earning capacity)에 제한을 가지기 때문에 빈곤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적- 96 -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다. 손상이라는 일차적 조건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개인적 혹은 사회적 투자의 불충실성은 장애인의 상대적인 생산성과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저임금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는 것이다.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현실사회에서 장애인이 빈곤에 빠지게 되는 과정의 일면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 단순히 소득이전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은 이러한 소득능력 제한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그러한 접근의 하나가 될 것이며, 상대적인 생산성 부족이 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임금수준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도록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다른 하나가 될 것이다. 다소 시의성이 떨어지는 자료이지만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 먼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2만원으로 같은 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00년 233.1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장애인 가구의 약 62.5%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자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단위 : 만원, %) 자료: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1.장애인 가구 중 조사 당시의 공공부조 제도인 생활보호제도의 대상자의 비율은 13.7%로 전체 가구의 비율인 2.6%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화 가능성이상대적으로 매우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장애인들의 교육수준 역시 국민 전체의 분포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은 무학 21.5%, 초등졸 30.1%, 중졸 14.2%, 고졸 24.1%, 전문대 이상 8.5%임에 반해, 전체 국민은 초등졸 26.6%, 중졸 15.7%, 고졸 38.0%, 저눈대 이상 19.7% 등으로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뚜렷하게 낮다.15세이상 1,332천명의 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이며, 취업자 수는 456천명(71.6%),실업자 수는 181천명(28.5%)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모두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인 직업분포를 보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 비중(23.6%)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4.8%), 장치․기계조작직(6.3%) 등의 비중이 낮다.취업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의 47.5%에 불과하고,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났다. 종사상의 지위를 보면 자영업자(40.2%)와 무급가족종사자(9.1%) 비율이 전체 근로자(각각 21.4%, 9.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한편,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이 추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약 16만원으로, 의료비가 8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통비로 약 3만원에 이른다. 세 번째 지출이 많은 비용항목은 보장- 97 -
구 구입과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약 1만5천원 남짓 된다. 장애인들이 첫 번째 요구로 꼽은 것은생계보장으로 50.3%가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의료혜택의 확대를 17.9%의 장애인이 요구하였다.이외에도 주택보장(4.6%), 세제혜택 확대(4.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4.5%) 등이 중요한 요구사항이었다.이상과 같은 객관적 조건 외에 장애인 스스로 경제상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도 매우부정적이다. 57.9%가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하였고, 34.4%가 중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지위에 대한 정체성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등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장애인들의 객관적 소득이나 부의 수준 외에,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차별이나 배제의 경험도 작용하고있으리라 본다.한편, 2002년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자활실태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추정한 결과, 2004년 6월말까지의 등록 장애인 153만 명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수급자 수는 287천명으로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용찬 외, 2004). <strong>빈곤과</strong> 장애의 악순환적 관계와 장애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건대,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넓게 보았을 때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여하는정책들과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변용찬 등(2004)도 비슷한 이유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을 통한 직접적 급여 외에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정책들도 포함시켜 다루고 있다.이러한 다양한 소득보장 관련 정책 혹은 제도들을 빈곤을 유발하는 요인과 제도의 성격 등에 따라분류하여 나타낸 것은 다음 와 같다. 크게 손상 기인성 요인과 사회적 장벽 요인으로 구분하여각각 다시 둘씩으로 구분했다. 손상 기인성 요인은 노동능력부족과 추가지출로, 사회적 장벽은 차별과배제로 구분했다. 이러한 문제 각각에 대해 보다 직접적으로 접근하느냐 혹은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개별 제도들을 분류해보았다.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구성빈곤원인 영역소 득 보 장 관 련 제 도대분류 소분류 직접적 간접적 보조적직업훈련재활의료비 지원노동능력 부족직업재활지원고용보호고용보장구지원손상기인성사회적장벽추가지출차 별배 제각종 수당연금, 산재보상 등소득이전차별금지 제도화특수교육진흥의무고용(고용촉진)거부금지 제도화세금감면이용료경감의식전환교육사회계몽접근권 보장편의증진보충급여그러나, 이 모두를 다룬다는 것은 이번 포럼의 의도도 아닐뿐더러 발제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98 -
므로, 이 가운데 주로 직접적 성격의 제도에 집중하되 발제자 입장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에 한정하여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현황과 문제점현재 우리나라에는 연금보험제도에 의한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 지급되는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연금보험제도에 의한장애연금은 제한된 적용대상과 급여액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재보험에 의한장해급여의 수준은 보수연액의 90%~15%로서, 중증장애에 대한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수준은 높은편인 것으로 평가 받는다.두 가지 수당제도 수급자격의 근간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책정과정에서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 장애인(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과 장애등급이 3-6등급에 속하는 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6만 원과 2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역시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18세미만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해당아동 1인당월 5만 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수당의 지급을 위해 올해 정부가 세운 예산의 규모는대략 8백8십억 원가량 된다. 이 제도들의 약점은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하지 못한 급여이다. 선별적 성격을 지니는 수당도 문제이며, 법률상의 규정은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보호수당의 지급시기도관심사이다.이 밖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서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연간 1회 10만원, 중학생의 부교재비 연간 1회 28천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연 1회 4만원 지원 등이 있다. 또 자립자금 대여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장애인에게 가구당 1,500만원 이내에서 이자 4%로 대여해준다.각종 공공요금, 공공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의 부담경감 제도는 정보화시대의 정보통신이나 정보습득에 대한 욕구, 의료과학기술발전에 향상된 재활보조기구 사용 욕구 등 생활수준향상에 따른 욕구가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할인의 품목이 제한적이고 고급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나. 대안과 쟁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장애인 가구원의 존재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책정을 위해 가구의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에 장애로 인한 표준 추가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표준 추가비용이라 함은 장애의 유형, 정도,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비용을 국가가 산출하여 공시한 것을 말한다. 수급자 가정의 장애인에 대해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급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고- 99 -
현재와 같이 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의 장애인에 대해서 선별적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권 밖의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가구와 소득역전 현상을 빚게 되어 형평의 원리에 위배된다.공공부조 제도에서 대상자 책정시에 장애인의 존재를 반영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편적 수당제도를 통해 모든 장애인에게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어야 마땅하다. 이 경우도 공공부조와 마찬가지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장애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할 수 있다. 현재 공공부조 성격을 지니는 선별적 수당제도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수당인 데모그란트(demogrant)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지급수준의 약 3배 정도이면 추가지출이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다.2)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갹출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함으로써 논의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1도입의 당위성 대 현실성: 우선 이 제도가 과연 최선의 소득보장제도이며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험형 연금제도 가입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주로 제기된다. 그러나, 보편적 수당제도와의 차별성과 상대적 우월성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기존 논의의 한계이다.다음으로, 현재 정부와 야당 일각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공약이행 유보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결국 앞으로 이 제도는 포기될 것인가, 아니면 변형된 형태로 도입될 것인가, 혹은 다소 기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도입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이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판단이 확고한 경우라면, 제도도입을 조기에현실화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제도를 도입할 경우의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구상도 병행돼야 한다. 이 제도의 재원은 조세수입에의한 일반재정이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징세의 구조와 규모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부유세 징수가 중단기적인 대안으로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수당제도와의 연관성: 수당제도와 무갹출 장애연금제도는 보완적 관계로 둘 것인가, 아니면 대체적 관계로 보아 수당제도를 폐기하고 연금제도로 이를 대신할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단 무갹출 연금제도가 개인 단위의 생활보장 성격의 이전지출 제도이므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시행이 된다면 수당제도는 의미가 없다. 연금을 수급하고도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다.점진적 시행을 주장하는 축에서 제시하는 현행 공공부조적 수당제도의 점진적 개선책은 과연 수용가능한 대안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한 현실론적 선택이겠으나, 비형평성과 불충실성의 문제를 장기화 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무갹출 연금제도보다 보편적 수당제도 쪽을 선택하는 편이 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소득 가구에 대한 수당지급이 갖는 정책효과성의 문제, 다른 제도(연금보험이나 산재보험 등)를 통해 이미 최저생활이 가능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낭비성지출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연계방식: 개인을 시행의 단위로 삼는 연금제도와 가구를 시행의 단위로 삼는 공공부조제도 사이에 대상자 책정이나 급여규모 결정시에 부딪치는 문제는 없겠는가에 대한검토가 필요하다.4연금보험제도와의 연계방식: 갹출제 연금과는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연금보험 재원의 일부를- 100 -
무갹출 연금에 지원하게 할 것인가? 기초연금을 채택할 경우 그 수준을 통일시킬 것인가? 담당기구는통합할 것인가, 별개로 할 것인가?5노동유인 감축효과 문제: 무갹출 장애연금이 노동유인을 감축시킬 요인은 없겠는가? 이 제도의도입을 추구하는 연대운동 대표자는 오히려 노동유인이 고양될 수 있는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미리 다양한 경우를 충실히 고려하고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개개 장애인의 노동가능한 정도를 측정하여, 이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6적용범위: 무갹출 연금제도의 적용 연령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급자의 노동능력 정도를 어떻게 급여 결정에 고려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연령층과 생활주기(lifecycle)상의 위치에 따라 지출사유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7급여종류 및 수준: 급여를 기초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채택할 것인지 혹은 어떤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앞에서 몇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급여의 규모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추정치는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전체 추정예산 규모를 3조원 안팎으로 잡는다. 2005년현재 정부의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 총액이 약 3천억 원 수준임과 비교할 때, 이 규모는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이 설 수 있다. 현재의 장애인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관련 정부예산의 합계액은 약 67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가. 현황과 문제점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형태로 의료비 지원과 교육비 지원이 있으며, 일상생활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이용료 감면제도가 있다. 아직 한정된 적용범위와 수혜대상 및 감면의 폭 등이 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리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다.나. 대안과 쟁점발전대안 모색과 관련하여 먼저 제기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 시책이 형평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과연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인가 하는 점이다. 만약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형평성과 보편성의 원리를관철시킬 수 있는 직접적 소득이전 정책으로 대체해 나가기 위해 이러한 부담경감 제도는 점차적으로없애가야 한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제도의 범위를 더 넓혀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가. 현황과 문제점15세이상 장애인 인구 1,332천명 중에 경제활동인구는 637천명(47.8%)이며, 취업자수는 456천명- 101 -
(71.6%), 실업자수는 181천명(28.5%)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실업률이 30%에 육박하고 있다. 취업한 장애인의 직업분포를 보면,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단순노무직의비중(23.6%)이 매우 큰 반면, 사무직(4.8%), 장치․기계조작직(6.3%) 등의 비중이 낮다. 취업 장애인의평균임금은 79만원(’00년 기준)으로 전체취업자 임금수준 166만원의 47.5%에 불과하다. 추가적인 분석을 해본 결과 학력, 연령, 성별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도 비장애인 임금의 86.4% 수준에 불과하다(나영돈, 2004).이러한 문제점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무고용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 중에는 기준고용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장려금과 부담금의 액수를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특히, 장려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와 노동부 측의 견해가 대조적이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나. 대안과 쟁점고용 장려금의 상향조정이라는 긍정적 유인책 접근보다는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부정적 유인책 접근법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장애인계는 그나마 저조한 장애인 고용을 더욱 저하시킬 우려를 들어서 크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 기업이 경제적 유익을 좇아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식에서 채용하도록 사회적 에토스를 실질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하리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방안을 제안한다.이렇게 할 경우 현재의 고용 장려금은 차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업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형식을 취하거나 고용보조금 형태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장려금의 하향조정에 착안하는 노동부의 발상과는 차이가 있다. 의무고용 제도에 의하여 고용된 장애인들에 대한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해고제한 제도의 채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 빈곤문제 배경의 복합성을 이유로 들어 빈곤문제 대응과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가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본 발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발제자가 처한 현실적 여건의제약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번 포럼의 의도가 직업재활과 고용, 교육, 의료 등의 영역은 사실상 배제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보장 문제를 다루는 제도에 초점을 둘 것을 주문했던 것으로 이해한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한정할 경우 사실상 논의의 초점은 무갹출 장애인연금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가장 첨예한 당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제자는 이 제도를 둘러싸고 검토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 쟁점들에 비중을 두면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간략히 다루었다.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기해볼 질문이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을 앞세우는 것과 같은 현실론은 의지없음의 다른 표현이다. 제도의 절박성에 공감하면 재원은 개발된다. 개혁 드라이브가 잦은 브레이크에주춤거리는 이면에는 자본가와 고소득층의 이해관계가 버티고 있다. 제도개혁을 위한 잰걸음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의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우회적이면서 의식의 저변에 영향력을행사하려는 노력에도 에너지가 투여되어야 한다.- 102 -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2004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 비율이 사업수 기준으로는 63.2%, 금액 기준으로는 62.1%에 달한다. 소득보장과 관련된 직접적 이전지출에 관련된 예산들은 물론 국고 직접보조사업으로 남지만, 간접적 혹은 보조적 제도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몇 가지는 지방이양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특별운송, 편의시설센터, 직업재활센터, 의료재활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보조가 그것이다. 지방간의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는가 하면, 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방 당국의 관심이 다른 부문에 비해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런 일이 재정상황이 나쁘거나 사회복지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장애인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빈곤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2005. “ (ambivalent disablism) ,” 『』 26:5-34.․. 2005. “ .” 『』 57 1.. 2004. “ .” . 『2005 』. . 2004. 『 』. .․, 2001. 『2000 』. 2002. “ ‘’ ,” 『 』.. 2004. “ : .” 『』 56 3.. 2002. " ". 『(VOICE)』 6: 16-21.. 2000. “ : ,” 『』 46.. 2003. “ : ICIDH-2 ICF .” 『2003 』.. 2003. “ : ”, ().Bromley, Catherine and John Curtice(2003). "Attitudes to Discrimination in Scotland". Scottish Executive Social Research, 2003.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0. Disability, poverty and development. London: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04. “Disability Knowledge and Research: Assesssing Connections to DFID'S PovertyAgenda.”Morris, Jenny. 2004. "Independent living and community care: a disempowering framework." Disability & Society, Vol. 19, No. 5:427-442.Sayce, Liz and O'Brien, Nick. 2004. “The future of equality and human rights in Britain: opportunities and risks for disabledpeople.” Disability & Society Vol. 19, No. 6: 663-668.Thomas, Philippa. 2004. DFID and Disability: A Mapping of 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Disability Issues.DFID and Disability Mapping Report. www.disabilitykar.net- 103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장애인:토론1(별첨)토론자 : 양영희(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104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장애인:토론2(별첨)토론자 : 왕진호(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105 -
많은 여성주의 학자들은, Esping-Anderson(1990)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속에서 계급(계층)에 기초하여 복지국가 유형을 비교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성(gender)이 계급(계층) 등과 함께 중요한 분석차원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성(gender)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여성의 문제(women's issue)를 다루는 차원으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 체제의 본질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통합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Orloff, 1993, 1996; O'Connor, 1993; Sainsbury, 1999). 즉,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 복지국가의 주요영역에서 발생하는 사회권,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고, 이는 성(gender)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사회권과 관련한 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빈곤문제의 접근도 예외는 아니다. 빈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결과적으로 사회의 자원배분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문제,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문제 역시 다른 사회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위해서는 성(gender)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랜 빈곤의 역사에 비해 빈곤문제에 대한성적 차원의 조명은 불과 30년이 채 안되었다. 빈곤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파악되기 때문에 여성이 주로 가구의 일원인 피부양자로 머물던 것에서 미혼모, 이혼, 사별 등으로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빈곤문제의 성적 차원이 가시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Millar and Glendinning, 1987).Pearce(1978)는 미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되어가는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최초로 빈곤에 대한 성적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정책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미국 16세 이상 성인빈민 중 3명 중 2명은 여성이며,노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혔다(Pearce,1978). Peterson(1987)도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여성가구주(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빈곤의 여성화는빈곤인구 구성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Peterson, 1987).- 106 -
Millar & Glendinning(1989), Millar(1996)도 빈곤 위험이 양성간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빈곤의성영역(gender dimension of poverty)을 구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성별분업에 의한 자원통제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는 노동시장 접근, 가족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착‧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으로 귀결된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 그리고 진입을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보장제도로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보장수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Millar and Glendinning, 1989;Millar, 1996; 김영란, 1997; 한혜경, 2001; 이상록, 2001; 강남식 외, 2001; 이혜경 외, 2002; 박영란 외, 2003).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빈곤의 여성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이다. 이혼의 증가, 고령화로 인하여 여성가구주 가구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가족내 성역할, 사회보장체계에서 경제적 자원배분의 소외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19.1%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여성가구주 가구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 현재 48.3%로 OECD 동평균인 64%에 훨씬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고(통계청, 2003), 여성의 경제활동의 질도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 및 영세 자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안주엽 외, 2001, 2002; 송호근, 2002). 48) 또한 여성의 대부분이경제활동의 기간과 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고용보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배제되어 있고(박순일 외, 2001; 석재은, 2003), 여성의 보살핌 노동 및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거의 부재하다(김태홍, 2001). 이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의 사망, 가출 혹은 이혼, 질병 등으로 여성가구주가 되었을 경우 그 가구가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은 매우 높을 것이고, 여기에 여성가구주 가구증가추세의 결합은 빈곤의 여성화를 결과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최근 새로운 빈곤으로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빈민(working poor)의 경우에도 그 핵심적 구성에는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노동이 놓여져 있다. 또한 노동시장적 성과와 연계되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의 수급권에서도 성격차는 현저하다(석재은, 2004). 또한 가족내 불평등과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나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 노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이와 같이 국가-시장-가족 영역에서체계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배제는 결과적인 빈곤을 야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맥락에서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빈곤을 포괄하는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립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작동구조를 관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사회적 배제와 결과적 빈곤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빈곤의 성적 격차의 문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즉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배제의 개념과 성통합적인 관점에서 빈곤개념을 재정립해보고자 한다.48) 노동시장에서의 종사상 지위별 성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2년 현재 여성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63.5%이며, 상용은 21.3%, 임시는 29.1%, 일용은 13.1%인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64.3%이며 상용은 37.8%, 임시는 17.0%, 일용은 9.5%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근로자 비중은 비슷한데도 상용직 비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16.5p 낮은 반면, 임시‧일용직 종사자 비중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15.7%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불안정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여성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36.5%인데, 자영업주 19.4%, 무급가족종사자는 17.1%인 반면, 남성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35.7%이고, 자영업주 34.0%, 무급가족종사자는 1.7%로 나타나,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높은 반면, 남성은 자영업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7 -
복지국가에 관한 여성주의 논의는 복지국가의 가치기반에 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의 성별분업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및 노동시장내 성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 배제되고 독립적 경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복지정책들 역시 이러한 현실적 전제를 바탕으로 남성의 임금노동, 남성 시민권에 기반하여구성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와 배제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이혜경.홍승아, 2003).Lewis(1992)는 성별분업구조에 기반하여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의 강도에 따라 복지국가모델을 세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강한 남성부양자 모델로,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남편에확고히 종속되어 있고, 여성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세금 등의 문제는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집에서 보살핌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확보되는 형태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이 대표적 국가이다. 둘째, 온건 남성부양자모델은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제공되지는 않는 유형으로, 프랑스가 대표적 국가이다. 셋째, 맞벌이 모델은 단일생계부양자가 아니라 부부의 취업이 적극 장려되고 남성부양의 개념이 축소되고, 여성의 사회권이 정립되어 있고, 가정내 무급노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유형으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다.Sainsbury(1996)는 가족이데올로기, 수급조건, 급여단위, 과세단위, 보살핌 노동에 대한 국가개입의형태를 중심으로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별적 모델(individual model)을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Sainsbury(1999)는 이를 수정, 발전시켜 권리가 개인에 기초하는가 혹은 가족관계나 결혼상태에 기초하는가, 수급권에서 젠더간의 차이가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에 기초하는 정도, 보살핌에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 유급노동에의 접근성 정도 등에 따라 남성가장체제(Male Breadwinner),분리된 젠더 역할체제(Separate gender model), 개별적 소득-보살핌체제(Individual earner-carer)등세개의 젠더정책 체제로 제시하였다.Orloff(1993)은 Esping-Andersen(1990)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성관점을 통합시켜 복지국가의 성별화된 차원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가족과 여성의 무급노동을 고려하여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차원으로 재구성하여야 하고; 둘째, 계층화 차원 역시 노동시장내 계급위계에만 주목하고있어 노동시장 밖의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안되지 않고 있어 성위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시민권/탈상품화 차원은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전제, 탈상품화 결과가 남녀에게 달리 적용되는 결과를 간과한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수용해야 하며; 넷째, 여성들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향상이 필요하며; 다섯째,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혜경.홍승아, 2003).여성주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가족을 재발견하여 가족이 복지공급에 중요한 주체이며 사회와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제까지 가족은사적영역에서 개별가족의 책임하에 규정되고 부담되어진 가사노동 및 보살핌노동을 무임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공급주체였다.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족내 무급노동은 시장과 사회에서 활동하는 임금노동자의 일상적, 세대적 유지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관계는 비가시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연구는 복지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성문맹적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여성의무급노동이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하는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O'Conner(1996)는 여성과 복지국가 논의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이라는 문제에- 108 -
서 성통합적 복지국가 체제(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의 문제로 이전되었음을 지적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논의에 단순히 성을 ‘부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성을 ‘통합’시킴으로써 복지정책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이혜경.홍승아, 2003). 일반적으로 빈곤은 물질적인 차원과 비물질적인 차원을 모두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분명한 실체 때문에 빈곤을 물질적 차원의 빈곤으로 이해하고 대처해왔다. 빈민의 기회와 활동에의접근 및 참여의 배제는 인식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비물질적 차원의 빈곤이다. 빈곤의 원인인 동시에결과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은 빈곤의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차원에도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통상 손에 잡히는 분명한 실체 때문에 물질적 차원의 빈곤에만 초점을 두고 접근한 기존의 빈곤개념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빈곤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Sen, 2000: v).사회적배제의 악순환고리는 다음과 같다. 현행 생산물의 상실 --> 기술상실과 장기적 손상 --> 자유의 상실과 사회적 배제 --> 심리적 상처와 비참함 --> 질병과 사망률 --> 인관 관계의 상실 -->동기의 상실과 미래 일 --> 성과 인종 불평등 --> 사회적 가치의 약화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Sen, 2000: 1). 빈곤은 단순히 소득의 부족으로 규정하는 것도 장점이 없지는않다. 우리 삶의 궁핍이 빈번히 소득의 불충분성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소득은빈민의 삶의 중요한 원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빈곤은 단지 저소득의 문제로서만이아니라, 빈민의 삶의 개념에서 보아야만 한다. 소득은 박탈 없는 좋은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소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다.빈민의 삶의 개념에서 빈곤을 보는 관점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리언(Aristotelian)은 인간 삶의 풍요성을 활동의 측면에서 삶을 탐색함으로써 인간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성과 정확히관련된다고 설명된다. 또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도 궁핍하지 않은 삶(수치심을 갖지 않고 남들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살 자유로 필수재를 규정한다. 즉, 빈곤을 최소한의 고귀한 삶을 영위할 능력이 결핍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빈곤을 능력(capability)으로 보는 관점은 불가피하게 다차원적이다. 첫째, 사회적 배제는 직접적으로 능력 빈곤의 일부분일 수 있다.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는 무능력, 즉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의 배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박탈이다. 둘째,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는 우리 삶의기회들을 더욱 제한함으로써 또 다른 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즉, 고용되거나 혹은 크레딧을 받는 기회로부터의 박탈은 경제적 궁핍을 초래하고 또 다른 박탈을 야기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수단적으로 다양한 능력 결핍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능력 결핍의 일부분일 수 있다.사회적 배제의 접근을 관계적 모습(relational feature)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매우 장점이 많다. 어떤의미에서 능력 관점은 이러한 관계적 연관성을 놓치도록 하고 과도하게 개인주의적이고 불충분하게사회적이도록 하는가? 개인은 관계적 박탈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보여지지만, 능력분석의 초점은 개인적 박탈의 사회적 원인에 매우 민감해왔다. 예컨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관심과 동시에 사회적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요인들 모두에 초점을 두고 있다.사회적 관계를 본질적 중요성과 수단적 중요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제된다는 것은 가끔 그 자체로 박탈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즉, 다른 사람과 관계할 수 없고 공동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109 -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궁핍화할 수 있다. 이것이 사회적 배제의 본질적 관련성이다. 반대로 관계적 결핍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쁜 결과를 이끌 수도 있다. 신용시장에 접근권을 갖지못하는 것은 원인적 연결고리를 통하여 소득 빈곤 혹은 부자가 될 수 있는 흥미있는 기회를 낚을 수없는 등 다른 박탈을 초래한다. 분명히, 특정한 관계적 박탈은 본질적이고 도구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은 직접적으로 한 개인의 삶을 궁핍화하며, 또한 사회적 계약을통해 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감소시킨다. 그런데, 그것들은 독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들이 관련될 때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박탈과 도구적으로 중요한 장애의 종합적 범주내에서 각각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원인적 과정의 본질이 각각의 관점의 관련성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이다.적극적 배제(active exclusion)와 수동적 배제(passive exclusion)의 구분 역시 유용한 구분이다.배제가 의도적인 정책에 의해 발생할 때, 적극적인 배제라고 한다면, 박탈이 의도적이지 않은 사회적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때, 수동적 배제라고 할 수 있다. 이민자의 정치적 배제가 적극적 배제의 대표적 예라면, 침체경제와 빈곤의 결과적 강화에 의해 발생하는 <strong>빈곤과</strong> 고립이 수동적 배제의 대표적 예이다.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빈곤개념의 조명은 결과적인 소득의 결핍상태로서의 빈곤 뿐만 아니라 빈곤을초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관계, 즉 국가-시장-가족 영역에서의 자원접근에서의 배제로 인한 비물질적 빈곤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여성 빈곤대책 역시 이와 같은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영역별 빈곤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본다.〔그림 1〕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빈곤국가:사회보장수급권가족:무급노동의사회적 보상성통합적 접근시장:노동시장의접근권(참여&질) 그동안 한국에서도 빈곤의 여성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혜경(1998)은- 110 -
1982~1995년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인구의 2/3가 여성이며, 빈곤한 노령인구 중에4/5가 여성이라는 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해 최초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이혜경, 1998). 그 뒤를 이어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대우패널)를 이용한 유정원(2000), 정책기획단조사자료를 활용한 이혜경 외(2002),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한 여지영(2003) 등이 빈곤의여성화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시도해왔다. 또한 몇몇 연구들은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에 초점을두고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접근하기도 하였다(박영란‧강철희, 1999; 박경숙, 2001). 그러나 한국의빈곤의 여성화에 관한 실증 분석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선행 연구의 선도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 자체의 한계, 분석내용의 제한, 비교기준을 결한 분석모형의결함, 분석방법의 부정확성 등 선행연구들의 한계는 보다 정확한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한 보다 신뢰성 있고 정확한 자료를 생산하는데 그 일차적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구주) 빈곤의 심각성을 신뢰성 있는 전국자료를 바탕으로 남성(가구주) 빈곤이라는 비교기준하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빈곤문제에 성(gender)적 차원의 분석과 접근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빈곤대책 역시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에서 의 자원배분의 소외로부터 중층적으로 귀결된 결절점에 위치한 성적 접근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1997년말 경제위기 전후를 포함하는 분석기간을 통하여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제위기 국면에서, 또한 이후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빈곤의 성적격차(gender-poverty gap)가 어떠한 역동성을 보이며 변화되어 왔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빈곤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은 무엇이며, 그 변화양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성(gender)과 성의 특성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조건들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의미를 정리하고,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분석자료와 측정본 연구에서 빈곤실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전국소득조사자료로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원자료(1996~2002)와 가구소비실태조사원자료(1996, 2000)이다. 두자료를 모두 활용한이유는 각각의 조사자료가 가지는 장점과 한계점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활용하여야만 여성 빈곤의 실태 및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는 ‘전국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2인 이상’ 가구 중 5,2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을 일계부 기장방식에 의해 매월 조사‧취합하되, 매분기 및 연간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현재 활용가능한 전국규모의 가구소득‧소비지출자료들중 가장 빈번한 주기로 발표되는 자료로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빈곤동향의 신속한 파악에 유용한 대표적인 조사자료이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만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농어촌가구가 제외되어 있으며, 지출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와 함께 자영업자, 실업자, 노인‧아동 등 비경제활동자를 포함한 비근로자가구도 조사하고 있으나,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만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동 자료로 전반적인 빈곤 및 소득분배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도시지역 2인 이상 근로자가구’라는 제한된 조사대상으로 인하여- 111 -
전국 가구의 대표도는 35.2%에 불과하며, 특히 빈곤가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1인가구, 농어촌가구,비근로자가구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제 현실보다 빈곤상태가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에서 누락된 1인 가구, 농어촌가구, 비근로자가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27,000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표 작성방식에 의해 5년을 주기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전국 규모의가구소득‧소비실태조사 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조사대상을 포함하는 대표성을 갖춘 조사 자료이다. 그러나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는 도시가계조사자료와 달리 조사주기가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위기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구소득‧소비실태의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전후의 빈곤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활용하고, 빈곤 여성가구주의 특성과 빈곤 영향요인 등의 분석에서는 대표성이 높은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빈곤율 파악을 위한 빈곤선으로 절대빈곤선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함께, 상대적 빈곤선이라 할 수 있고 OECD, EU 등 빈곤율의 국제비교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를 각각 사용하였다. 가구규모의 영향을 배제키 위해 최저생계비는 가구규모별로 공시된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으며, 중위소득 50%의 경우에는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사용한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ε, ε=0.5)를 이용하여 가구규모별 빈곤선을 적용하였다.〈표 1〉 빈곤율 계측을 위한 빈곤선: 1인 가구 기준(단위: 원)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최저생계비 1) 225,774 235,704 253,473 314,574 324,011 333,731 345,412중위소득의50% 2) 500,000(499,408) 3) 538,428 487,477 505,182542,256(520,000)3)주: 1) 정부가 발표하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임. .2) OECD 가구균등화지수(가구소득/(가구원수)ε, ε=0.5)를 이용한 빈곤선으로, 1인 가구 기준임.3)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 중위소득 50% 소득임.595,000 631,9962) 분석방법‘빈곤의 여성화’는 그 용어 그대로 빈곤인구의 주류가 여성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정의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빈곤의 여성화 현상이 발견되는지, 발견된다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빈곤인구 중에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빈곤은 개인소득이 아니라 가구단위 소득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이 가구원 개개인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전제하에 빈곤여부를 파악한다. 가구원으로서의 개별 여성이 실제로 가구소득의 1/가구원수 만큼에 대한 통제권(향유권)을 갖는지의 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구원으로서 여성의 빈곤여부는 가구주 남성의 빈곤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여성가구원이 빈곤한 것은 남성가구주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가구원의 빈곤은 여성의 성적 특성에 의한 빈곤문제라고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빈곤문제의 접근에서 성(gender)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여성이가구주인 가구,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에 초- 112 -
점을 두고 분석할 것이다.구체적인 연구질문에 따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하기위하여 빈곤인구(가구) 중에 여성(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빈곤율을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함으로써 빈곤의 성적격차(gender-poverty gap)를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빈곤대책에 대한 시사점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연령별로 남성가구주과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을 비교하는 접근도 시도할 것이다. 빈곤율을 계측하는 과정은, 빈곤이개인단위가 아니라 가구단위의 소득으로 측정되므로 먼저 빈곤가구를 파악하여야 한다. 가구규모별빈곤선을 적용하여 가구규모별로 빈곤선 이하에 있는 빈곤가구를 파악하고, 빈곤가구에 규모별 가구원수를 곱하여 얻은 총합으로 전체 빈곤인구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빈곤인구를 전체인구로 나눔으로써 빈곤율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가구주 성별 빈곤율은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가구를 구분한 다음, 각각 여성가구주 가구 중의 빈곤율과 남성가구주 가구 중의 빈곤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얻어질 수 있다. 또한 전체 인구 중에 빈곤여성과 빈곤남성은 빈곤가구 중에 전체가구원의 성별을 파악하여 총합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둘째, 빈곤의 여성화가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그리고 이후 회복과정에서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떠한변화를 보이는지를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의 변화를 비교하고 빈곤의 성적격차의 변동을 분석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가구주 성별 빈곤율을 각각 비교함으로써, 특히 경제위기와 그 이후 과정에서 가구주 성별로 절대적 <strong>빈곤과</strong> 상대적빈곤의 변화 양상이 가지는 의미도 파악해 볼 것이다.셋째, 어떤 특성을 가진 경우 빈곤 여성가구주가 될 위험이 높은가를 분석하기 위해,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주의 인적 특성과 가구특성별 빈곤율을 살펴본다. 특히 시간적 비교를 통하여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도 분석한다.넷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및 가구의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분석방법은 크게 3가지로구분된다. 하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빈곤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가구주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를 분리하여 빈곤의 영향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법은 빈곤의 성적 접근이 가장 필요한 미성년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의영향요인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하는 것이다.빈곤가구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빈곤(0), 비빈곤(1)의 이항변수로 만들어 종속변수로 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던 가구주 인적특성, 취업특성, 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다. 가구주 인적특성 변수들에는 가구주의 성별,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결혼상태를, 가구주 취업특성 변수들에는 가구주 취업상태, 가구주 종사산업을, 가구특성 변수들에는 가구원수,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유형, 가구거주지역으로 각각 구성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결혼상태, 취업상태, 종사산업, 가구유형, 거주지역은 더미변수로 만들었으며, 연령, 연령제곱,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내취업자수는 연속변수로 하였다. 또한 개별 분석모형은 가구주 인적특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Model 1), 가구주 취업특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Model 2), 가구특성이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Model 3), Model 1,2,3의 모든 독립변수들이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Model 4), Model 4와 동일한 모형에 상호작용 독립변수를 추가 투입한 모형(Model 5)으로 구성하였다.- 113 -
〈표 2〉 빈곤 영향요인 분석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독립변수변수명종속변수 빈곤여부 비빈곤=0, 빈곤=1가구주 성별 남성=0, 여성=1가구주 연령 가구주 연령 (세)가구주 교육수준 교육연수 (년)가구주인적 특성가구주취업특성가구 특성변수값가구주 결혼상태미혼/ 기혼 + 이별,사별 등 무배우/ 기혼 + 유배우 (기준변수)가구주 취업상태무직/ 상용직 임금근로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자영자 (기준변수)제조업 (기준변수)/ 건설업/ 도소매 및 판매업/ 음식숙박업/가구주 종사산업전기가스 및 운수통신/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기타 서비스업/농림수산업가구원수 가구원수 (명)가구내 취업자수 가구내 취업자수 (명)가구유형독신가구 (기준변수)/ 부부(+미혼자녀)가구/ 편부모가구/ 기타가구가구 거주지역 특별시,광역시 = 1, 비광역시 = 0빈곤가구 영향요인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Model 5: (Pi = 빈곤확률, 1-Pi = 비빈곤 확률, dsex: 성별더미, age: 연령, age2: 연령제곱, sch: 교육연수, dmar: 결혼상태 더미, demp: 취업상태 더미, dind: 종사산업 더미, num: 가구원수, wnum: 취업자수, dtype: 가구유형 더미, darea: 지역 더미)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격차는 현격하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분위별 분포도는 대다수가 하위층에 몰려 좌상향우하향의 급경사를 보이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 소득분위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평탄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1분위에 무려 1/4에 근접한 23.4%가포진되어 있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가장 낮은 6.2%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의절반이 넘는 51.5%가 하위층인 3분위 이하에 포진되어 있는 반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평균분포보다낮은 23.9%만이 3분위 이하에 분포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하위층의 주류이며,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그 현상은 심화된다.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저소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득의 성적 격차를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114 -
〔그림 1〕 가구주 성별 소득 10분위 분포(2000)2523.42201515.47108.4212.599.3110.29 10.239.15 9.0810.76 10.97 11.11 11.1411.5956.187.256.715.81 6.034.50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남녀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여성가구주 가구는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중 여성가구주 비율이 1996년 16.6%에서 2000년 18.5%로 증가한 대신, 남성가구주 비율은 동기간83.4%에서 81.5%로 감소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점진적 증가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가구주가구의 빈곤율은 동기간 8.3%에서 16.9%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가 증가하는 동시에 여성가구주 중 빈곤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빈곤의 여성화를 보여주는 중요 지표이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역시 1.8%에서 6.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동기간 빈곤의 성적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18.5%인 데 비하여 빈곤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 2.5배인 45.8%로 나타났다. 이 역시 빈곤의여성화를 보여준다.〔그림 2〕 성별 가구주 비율과 빈곤율 변화901883.416.981.58016701460125010408.38306.462016.618.54101.8201995 20000여성가구주 가구율 남성가구주 가 구율 여성가구주 빈곤율 남성가구주 빈 곤율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이고,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7.0%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연령별- 115 -
빈곤가구 비율을 보면, 20세 미만의 경우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9.7%, 10.0%로유사하나, 20-64세 연령층의 경우 여성가구주 가구는 11.8%, 남성가구주 가구는 5.3%로 20-64세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64계층이 근로연령계층이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연령계층이라는 점에서 이들 연령계층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특별히 높다는 것은 여성가구주 가구에 대한 자활, 사회보장정책에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것이다.〈표 3〉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 및 빈곤율(2000)(단위: %)가구주 연령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가구(A)가구(B)전체가구A/B(배)20세 미만9.710.09.81.0가구20-64세11.85.36.22.265세 이상56.129.339.31.9전 체 21.0 7.0 10.1 3.0가구원20세 미만20-64세65세 이상9.811.651.09.85.425.19.86.031.21.02.22.0전 체 16.9 6.4 7.9 2.6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빈곤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경우, 10가구 중 4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빈곤율이 56.1%로 1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빈곤율이 29.3%로 나타나, 여성노인 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역시 1.9배 높았다. 가구주 성별 가구원을 감안한 빈곤율에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7.9% 보다 2.6배 높았다.〔그림 3〕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율 비교605051403025.12016.9109.89.811.65.46.4020세 미만 20-64세 65세 이상 전체여성가구주남성가구주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116 -
한편, 성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여성 중 8.7%의 여성이 빈곤하고, 남성 중 7.1%의 남성이 빈곤하다. 즉, 빈곤인구 100명 중 여성이 55명이고 남성이 45명으로 여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빈곤가구의 성별 빈곤인구(2000)여성남성빈곤 여성가구주가구(45.8)가구원18.014.3빈곤 남성가구주가구(54.2)가구원6.46.4(단위: %)전체 빈곤가구(100.0)가구원8.77.1전체 16.9 6.4 7.9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다음에서는 1997년말 경제위기가 빈곤의 측면에서 가구주 성별간에 어떤식으로 차별적으로 영향을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빈곤율은 1996년 8.4%에서 2000년 16.9%로 2.0배 증가하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동기간 1.8%에서 6.36%로 3.5배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1996년에는 4.6배였으나, 2000년에는 2.7배로 줄어들었으나, 가구주 성별간 빈곤율의 격차는 동기간 6.6%에서 10.5%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중위소득 50% 기준으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1996년 28.5%에서 2000년에는 34.2%로 1.2배 증가하였으며,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동기간6.74%에서 11.04%로 1.6배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1996년 4.2배에서 2000년 3.1배로 줄어들었으나, 가구주 성별간 빈곤율의 격차는 동기간 21.8%에서23.2%로 오히려 증가하였다.이와 같이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모두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빈곤위험의 보편적 증가로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간에 빈곤위험의 배수는 감소하였으나, 빈곤율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위기 과정의 대량실업의 여파가 비교적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갖고 있던남성가구주 가구를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경제위기 이전의 낮은 빈곤율이 경제위기 과정의 급격한 빈곤율의 증가를 더욱 극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에는경제위기 이전에도 이미 상당수가 빈곤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상태에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선의경계선에 다수 포진하던 저소득층이 빈곤층으로 내려앉음으로써, 극적인 증가는 남성가구주 보다 덜해 보이지만, 오히려 양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상당수가 더욱 주변으로 내몰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과정에서 절대빈곤율의 증가에 비해 상대빈곤율의증가는 비교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상위 20%를 제외한 전 소득계층의 소득이 동반하락하였기 때문에 중위소득 50%라는 빈곤선 자체도 같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경제위기 과정에서 중하위층 소득의 동반하락을 반영하는 상대빈곤율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절대빈곤율은 상대적인 소득동향에 관계없이 절대적인 생활필요소득이므로 경제위기과정에서 빈곤율의 현격한 증가를 보이는 것이다.- 117 -
〈표 4〉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비교: 가구소비실태조사 기준최저생계비빈곤율(%)1996년 대비빈곤율 증감(배)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1996 2.70 1.82 8.37 - - - 4.60 6.552000 7.94 6.36 16.88 2.94 3.49 2.02 2.65 10.52중위소득 50%빈곤율(%)1996년 대비빈곤율 증감(배)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1996 11.19 6.74 28.50 - - - 4.23 21.762000 16.12 11.04 34.23 1.44 1.64 1.20 3.10 23.19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B/A(배)B/A(배)B-A(%)B-A(%)한편,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최근 분석시점이 경제위기의 영향이 깊게 남아 있는 2000년임에 비하여, 도시가계조사자료는 경제위기가 거의 회복된 2002년까지 포함하고 있어(실제로 절대빈곤율은경제위기 이전상태로 회복), 동자료를 통하여 경제위기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정에서의 빈곤의 성적격차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기반하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9.3%에서 1997년 6.8%로 낮아지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13.2%, 1999년 16.9%까지 높아졌고, 2000년 13.3%, 2001년 11.0%, 2002년 9.3%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5%에서1997년 2.2%로 낮아지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5.6%, 1999년 5.9%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4.1%, 2001년 3.4%, 2002년 2.4%로 다시 낮아졌고, 거의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또한 성적 빈곤격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75배 수준이었는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는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여성가구주 가구의 최고 2.6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 2.34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83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2.2%에서 1997년 20.5%로 낮아졌다가,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22.0%, 1999년 24.0%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22.1%,2001년 21.6%, 2002년 21.9%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7.2%, 1997년 7.0% 수준에서 1997년말 경제위기를 계기로1998년 9.3%, 1999년 8.7%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7.7%, 2001년 7.6%, 2002년 7.0%로 다시 낮아졌고,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하여최저 2.4배에서 최고 3.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가 남성가구주 가구보다 빈곤율이 최저 12.6% 포인트에서 최고 15.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1배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최고 4.8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2.36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12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118 -
〈표 5〉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비교: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최저생계비전년대비빈곤율(%)B/A B-A빈곤율 증가율(%)(배) (%)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1996 3.25 2.47 9.27 - - - 3.75 6.801997 2.80 2.24 6.83 Δ13.8 Δ9.31 Δ26.3 3.05 4.591998 6.35 5.61 13.15 126.8 237.0 92.5 2.34 7.541999 7.26 5.87 16.89 14.3 4.63 28.4 2.88 11.022000 5.37 4.09 13.29 Δ26.0 Δ30.3 Δ21.3 3.25 9.202001 4.44 3.36 11.04 Δ17.3 Δ17.8 Δ16.9 3.29 7.682002 3.46 2.42 9.28 Δ22.1 Δ28.0 Δ15.9 3.83 6.86중위소득 50%빈곤율(%)전년대비빈곤율 증가율(%)B/A(배)B-A(%)전체 남(A) 여(B) 전체 남 여1996 9.25 7.23 22.20 - - - 3.07 14.971997 8.95 7.00 20.54 Δ3.2 Δ3.18 Δ7.48 2.93 13.541998 10.75 9.31 21.95 20.1 33.0 6.86 2.36 12.641999 10.91 8.71 23.95 1.5 Δ6.44 9.11 2.75 15.242000 10.02 7.71 22.09 Δ8.2 Δ11.5 Δ7.77 2.87 14.382001 9.92 7.60 21.59 Δ1.0 Δ1.43 Δ2.26 2.84 13.992002 9.70 7.01 21.88 Δ2.2 Δ7.76 1.34 3.12 14.87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의 절정이었던 1998년과 그 이후 회복과정에서 보여진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간의 빈곤율 전개 양상에 차별성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 빈곤율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9년에는 그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1998년에 빈곤율이 급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1999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보이고 2000년 이후에도 빈곤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즉,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급작스런 경제위기로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제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그 회복과정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빈곤율과 경제위기가 회복된 2002년 빈곤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보다 거의 3% 포인트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된다. 즉, 여성가구주 가구의경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수가 빈곤층에 계속 머물게 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의 성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빈곤의 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한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빈곤계층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또한 동기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화양상을 비교해 보면, 절대빈곤율의 변화가 큰 폭으로이루어진 반면, 상대빈곤율의 변화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전체 소득수준의 동향을 반영하는 상대빈곤선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빈곤율의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빈곤율에서도역시 빈곤의 성적격차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확대된 양상을 보이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 119 -
제위기 이전보다 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절대빈곤율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준다.〔그림 4〕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30.025.020.022.220.522.024.022.1중위소득50%기준여성가구주빈곤21.6 21.9율15.010.05.00.09.37.2 7.0 6.82.5 2.213.29.316.95.6 5.9최저생계비기준남성가구주빈곤율중위소득50%기준남성가구주빈8.7곤율최저생계비기준여성가구주13.3 빈곤율11.07.7 7.6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4.13.49.37.02.4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중위50%기준 여성가구주 중위50%기준 남성가구주 최저생계비기준 여성가구주 최저생계비기준 남성가구주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이 20세미만이 18.2%, 20-64세가 4.5%, 65세 이상이 34.4%로 나타나,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20세 미만이 18.4%, 20-64세가 11.6%, 65세 이상이 53.2%로 나타나, 노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높으며, 20-64세 근로연령계층 가구 순으로 나타났다.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20-64세 근로연령계층의 빈곤율이 가장 큰폭인 158%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65세 이상 노령계층의 빈곤율이54.7% 증가하였고, 20세 미만 계층은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과정에서 대량실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근로연령계층에게 그 타격이 가장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율의 변화폭이 가장 큰 연령계층은 65세 이상 노령계층으로 무려18.8% 포인트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64세 근로연령계층이 7.1% 포인트, 20세 미만 미성년계층은 0.2% 포인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계층의 경우 빈곤율이 18.8%나 증가한 것은 65세 이상 여성노인가구의 증가(7.2% 포인트)를 감안하더라도 빈곤화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위험에 노출되게 된 근로연령계층 여성가구주의 자활대책이 보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20 -
〈표 6〉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1996(A)2000(B)20세미만18.218.420-29 30-39 40-49 50-641.92.74.511.25.010.66.316.665세이상34.453.2(단위: %)전체9.321.0증감율(B/A) 1.1 42.1 148.9 112.0 163.5 54.7 125.8증감폭(B-A) 0.2 0.8 6.7 5.6 10.3 18.8 11.7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학력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무학 35.7%, 초등학교 8.3%, 중학교 5.0%, 고등학교 2.5%, 전문대학 4.0%, 대학교 1.7%로 나타나, 여성가구주가 무학일 경우 빈곤율이 현격히 높으며, 대체로 학력이 낮을 수록 빈곤율이 높아 학력과 빈곤율이 반비례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무학 58.3%, 초등학교25.3%, 중학교 12.8%, 고등학교 9.8%, 전문대학 2.8%, 대학교 2.5%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과 빈곤율간의 반비례 관계가 선명하게 나타났다.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로는 고등학교 학력의 빈곤율이 가장 큰 폭인 292%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204.8%, 중학교 156%, 무학63.3%, 대학교 47.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학 학력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빈곤율이 30%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의 타격이 미치는 영향의 학력간 차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대이상의 고동교육자에게는 빈곤이 오히려 감소하는 반면, 전문적 기술을 갖지 못한 채 취업율이 높았던 고졸 학력자에게 경제위기는 그 이전에 비해 빈곤위험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여진다.그러나 1996년과 2000년의 빈곤율의 변화폭이 가장 큰 학력계층은 무학으로 무려 22.6% 포인트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17.6% 포인트, 중학교 7.8% 포인트,고등학교 7.3% 포인트, 대학교 0.8% 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과 빈곤율의 증가폭도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위기 과정에서도 빈곤위험에 더 많이노출되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대책을 수립함에있어, 중‧저학력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마련 등 소득보장대책의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7〉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1996(A)2000(B)무학35.758.3초등학교8.325.3중학교5.012.8고등학교2.59.8전문대학4.02.8(단위: %)대학교 대학원 전체1.72.50.00.09.321.0증감율(B/A) 63.3 204.8 156.0 292.0 Δ30.0 47.1 0.0 125.8증감폭(B-A) 22.6 17.0 7.8 7.3 Δ1.2 0.8 0.0 11.7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결혼상태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유배우 5.6%, 무배우 10.8%로 나타나, 무배우의 경우에 빈곤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 121 -
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유배우 11.2%, 무배우 25.5%로 나타나고 있어 역시 무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현격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과 2000년의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율 및 변화폭 모두에서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율의 증가가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의 경우 빈곤율이 100% 증가한 반면, 무배우의 경우 136% 증가하였으며, 단순 변화폭의 면에서도 유배우의 경우 5.6%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무배우의 경우에는 14.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빈곤 여성가구주의 결혼상태별 분포1996(A)2000(B)유배우 무배우 전체5.611.210.825.59.321.0증감율(B/A) 100.0 136.1 125.8증감폭(B-A) 5.6 14.7 11.7(단위: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996년의 경우 빈곤율은 1인 가구 12.4%, 2인 가구 6.7%, 3인 가구 7.3%, 4인 이상 가구 8.0%로 나타나, 1인 가구의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의 경우에도 빈곤율은 1인 가구 31.9%, 2인 가구13.7%, 3인 가구 13.3%, 4인 가구 이상 13.0%인 것으로 나타나, 역시 1인 가구의 빈곤율이 현격히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빈곤율 증가율을 보면, 1인 가구가 157.3%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2인 가구 104.5%, 3인 가구82.2%, 4인 가구 이상은 6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폭의 면에서도 1인 가구가 19.5%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은 각각 7.0% 포인트, 6.0% 포인트,5.0%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빈곤위험에 훨씬취약하고 빈곤계층으로 많이 전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는 전체 여성가구주의 가구규모별 구성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동기간 1.2% 증가한데 비하여, 1인 가구의 빈곤율은157%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빈곤으로 인한 1인 가구의 사후적 증가보다는 1인 가구의 빈곤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표 9〉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규모별 분포(단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전체1996(A)2000(B)12.431.96.713.77.313.38.013.09.321.0증감율(B/A) 157.3 104.5 82.2 62.5 125.8증감폭(B-A) 19.5 7.0 6.0 5.0 11.7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고용형태별 빈곤율을 살펴보면,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빈곤율은 정규직의경우 1996년 7.1%에서 2000년 9.1%로 2% 포인트 증가한데 비하여, 비정규직의 경우 1996년- 122 -
13.1%에서 2000년 22.5%로 무려 9.4%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 증가율 면에서도 동기간 비정규직의 경우 빈곤율이 71.8% 증가한 반면, 정규직의 경우 28.2% 증가하였다. 이는 고용지위의 취약성이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도 빈곤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특히 비정규직의 빈곤율 증가는 여성가구주 중의 비정규직 비중이 동기간 9.1% 증가한 것을 그대로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보여진다.〈표 10〉 빈곤 여성가구주의 고용형태별 분포1996(A)2000(B)정규직 비정규직 전체7.19.113.122.57.812.0증감율(B/A) 28.2 71.8 53.8증감폭(B-A) 2.0 9.4 4.2(단위: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가구주 인적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1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가구주 연령이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경우에,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 유배우> 미혼 순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수준이 일정할 때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19% 증가하게 되고,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빈곤에 떨어질 확률은 11.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주 취업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Model 2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무직 >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의 경우 자영자보다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207% 증가하며,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자영자 대비 빈곤확률이 67.3% 증가하는 반면, 상용직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자 대비 빈곤확률이84.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종사산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제조업에 비해 빈곤확률이 2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특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Model 3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 작을수록, 독신가구 > 부부(+자녀)가구 > 편부모가구 순으로,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상태에 놓여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수준이 일정할 때 가구원수 1명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14.3%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수 1명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은 8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신가구에 비하여 부부(+자녀)가구의 경우 빈곤확률이24% 감소하며, 편부모가구의 경우 빈곤확률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대 광역시에거주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3 -
〈표 11〉 빈곤의 영향요인(빈곤=1)*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1.8578***0.29190.49470.1738**-0.11200.2169*-0.1541*1.190-0.0627* 0.894 -0.0702* 1.242**0.857** 0.939 ** 0.9320.0018***1.0020.0006*** 1.001 0.0007*** 1.001-0.1272*0.881-0.1396* 0.870 -0.1425* 0.867**0.664** 1.053 ** 0.967-0.4096*1.3800.0519 2.443 -0.0341 2.482**0.8934***0.9092***0.3223***-2.8744***1.1226***-1.8436***0.5144***-0.00120.17790.1447-0.1331-0.20970.16711.1679***3.0730.1581.6730.9991.1951.1560.8750.8111.1823.2150.0919-1.7109***0.4380***-0.10810.3992***0.3257*-0.2069-0.01440.3158**0.4589*1.0960.1811.5500.8981.4911.3850.8130.9861.3711.5820.3688-1.6708***0.3897***-0.02380.3838**0.1899-0.1499-0.01540.2936*0.3682-0.5489***1.4460.1881.4770.9771.4681.2090.8610.9851.3411.4450.578(+)6Likelihood Ratio Chi 2 (pr.)percent concordant3239.2502***77.63659.1216***76.4주: * p 독신가구 > 편부모가구 순으로,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상태에 놓여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독립변수들- 124 -
수준이 일정할 때 가구원수 1명이 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56.0% 증가하는 반면, 취업자수 1명이증가하는 경우 빈곤확률은 78.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변수를 투입한 Model 4의 경우 각각의 특성별 변수들을 투입한 경우와 몇가지 점에서 중요한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구주 성의 경우 가구주 인적특성만 투입하였던 Model 1에서는 가구주 성이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취업특성과 가구특성의 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된 경우에는 가구주 성 그 자체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이는 상당히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결과로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이 가구의 빈곤에 영향을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가지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가구특성이 결국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위험에 높게 노출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와 참여의 질이 남성가구주와의 빈곤위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취업특성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취업특성만 분석하였던Model 2에서는 무직이 자영자에 비해 빈곤할 위험이 207% 이상 높은 강력히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가구주 인적특성과 가구 특성이 같이 투입된 Model 4에서는 무직이 빈곤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성과 무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무직인 경우 덜 빈곤한 경우가 많은 반면(여성의 경우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선택적 무직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무직인경우 더욱 빈곤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모순적 현상이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킨 결과 성과 무직이,모두 각각의 특성별로 분석했을 때와 달리,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 해석은 무직과 연령제곱의 상호작용을 의심할 수 있다. 노령계층의 경우 빈곤확률이 높고 대다수가 무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제곱과 무직을 같이 변수로 투입할 때, 연령제곱 변수가 무직의 빈곤영향을 흡수해 버린 것으로 보여진다.이러한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Model 5를 설정하여 성과 무직변수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하여 성과 무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Model 4와 같이 가구주 인적특성, 가구주 취업특성, 가구 특성 등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빈곤가구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예상했던 바와 같이, 무직과 성의 상호작용변수가 강력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한결과 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남성인 경우보다 빈곤확률이 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직 변수는 가구주 성에 따른 모순적 영향혹은 연령제곱의 강력한 영향에 의해서 Model 5에서도 역시 유의미한 변수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다음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남성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빈곤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면에서는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간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가구주 취업특성면에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비빈곤확률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빈곤확률은 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가구주의 차이는 여성의 경우 상용직임금근로자라고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자영자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도소매판매업,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면에서는 남성, 여성 가구모두 독신가구에 비해 부부(+자녀)가구의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편부모가구의 경우 독신가구에 비해 빈곤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의 측면에서는 전체 빈곤가구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취업특성 이외에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영향요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 -
〈표 12〉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영향요인 비교(빈곤=1)가구주인적특성가구주취업특성가구특성변수상수성연령연령제곱교육수준미혼무배우상수무직상용직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건설업도소매및판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운수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업기타서비스업농림수산업상수가구원수취업자수부부(+미혼자녀)가구편부모가구기타가구6대광역시여성가구주남성가구주가구가구전체 가구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1.03320.03570.2919-0.1120 0.894-0.0813*** 0.922 -0.0564*** 0.945 -0.0627*** 0.9390.0009*** 1.001 0.0005*** 1.000 0.0006*** 1.001-0.1250*** 0.882 -0.1442*** 0.866 -0.1396*** 0.8700.0093 1.009 0.0134 1.014 0.0519 1.0531.0958*** 2.992 0.8400*** 2.316 0.8934*** 2.443-0.6130-0.47240.4988**-1.96860.2282-0.21910.0517-0.9800*0.14140.10230.5151***-2.1100***1.0281***-0.4437**-0.2162-0.2956***0.5420.6241.6470.1401.2560.8031.0530.3751.1521.1081.6740.1212.7960.6420.8060.744Likelihood Ratio Chi 2 (pr.)1878.0961***percent concordant87.4주: * p
〈표 13〉 미성년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및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 영향요인 비교(빈곤=1)가구주인적특성가구주취업특성상수성연령연령제곱교육수준무배우무직상용직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건설업도소매및판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운수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업기타서비스업농림수산업무직*성가구원수취업자수가구특성 편부모가구기타가구6대광역시Likelihood Ratio Chi 2 (pr.)미성년자녀를 가진여성가구주 가구미성년자녀를 가진남성가구주 가구미성년자녀를 가진전체 가구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3.72020.33750.61680.5561*** 1.744-0.0573 0.9440.0003 1.000-0.1551*** 0.8561.4605*** 4.308-0.0319-0.0004-0.1777***1.9845***-1.53400.42781.0283***-14.1312-0.3033-0.2847-0.0803-2.0979*-0.17430.80660.3879**-2.4153***-2.4243***-2.4258***-0.1378percent concordant주: * p
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많은 선행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중층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gender)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대책 역시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에서의 성적 차원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가가 확인되었다.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였으며,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인 18.5%의 2.5배인 45.8%였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0%에 비해 3배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을 감안한 빈곤율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6.9%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6.4% 보다 2.6배 높았다. 또한 가구주연령별로 20-64세 연령계층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으며,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1.9배 빈곤위험이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노인가구주 가구는 1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빈곤의 성적격차의 역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 절정기에서는이전시기에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던 남성가구주 가구에게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율 증가율이 더극심하게 나타나는 등 빈곤의 보편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양성간의 빈곤율의 격차는 경제위기시에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남성가구주 가구가 경제위기에서 비교적 빠른 회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수가 아직도 빈곤층에 머물면서 빈곤 고착화 현상을 보이고 있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보다 거의 3% 포인트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의 성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빈곤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셋째,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의 변화양상을 비교해 보면, 그 전반적인 양태는 절대빈곤율과 유사하지만, 절대빈곤율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진 반면, 상대빈곤율의 변화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소득수준의 동향을 반영하는 상대빈곤선의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같이 연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넷째,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별 빈곤율과 1996년과 2000년간 경제위기 영향으로 인한 빈곤율의 변화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53.2%로 가장높았으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율이 변화율이 가장 컸던 연령층은 근로연령계층인 20-64세 여성가구주였고, 65세 이상 노령 여성가구주의 빈곤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력과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의 경우 빈곤율이 58.3%로 가장 높고 대학교 이상의 빈곤율이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율의 변화율이 가장 컸던학력계층은 고졸계층으로 동기간 무려 292%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고졸계층여성가구주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 뒤를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무학의 순으로 빈곤율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계층이 경제위기의타격에도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배우 여성가구주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율이 2.3배 이상 현격히 높으며, 경제위기 과정의 빈곤율의 증가율도 무배우의 경우가 훨씬 높았다.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의 빈곤율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 증가율 역시 1인 가구가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2.5배 가량 높았고, 빈곤율 증가율도 비정규직이 훨씬 높았다.다섯째, 빈곤의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을 보면 가- 128 -
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가구주 연령이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경우에,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무배우> 유배우> 미혼 순으로 빈곤상태에 놓여질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취업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을, 무직 >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확률이 2배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을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수가작을수록, 독신가구 > 부부(+자녀)가구 > 편부모가구 순으로, 비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상태에놓여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의 경우, 취업특성 및 가구특성 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된 모델에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 자체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가지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가구특성이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위험에 높게 노출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와 참여의 질이 남성가구주와의 빈곤위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수 있다. 한편, 성과 무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 인적특성, 취업특성, 가구특성 등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빈곤가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여섯째,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영향요인과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영향요인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적특성면에서는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간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주취업특성면에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비빈곤확률이 유의미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임금근로자의 빈곤확률은 84%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가구주의 차이는 여성의 경우 상용직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자영자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일곱째, 미성년자녀를 가진 전체가구의 빈곤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직과 성의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결과, 가구주의 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녀를가진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무려 7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는 경우 빈곤위험은 1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에 비하여 빈곤위험이 무려 33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빈곤가구 분석결과와 달리 미성년자녀를 가진 빈곤가구 분석의 경우, 무직이 자영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 임시일용직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빈곤위험은 68.9% 증가하며, 취업자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빈곤위험은 7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녀를 가진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무직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데 반하여 미성년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무직이 유의미하지 않게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선택적 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인것으로 해석된다. Korpi(2000)는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 정책모델을 가족모델, 중립모델, 개별모델로 유형화하고, 성 정책모델 유형별로 경제활동참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의 성분업모델에 입각한 가족모델을 성 정책모- 129 -
델로 삼는 국가군에서 여성의 연령과 결혼상태 및 돌볼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활동에서의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부부를 모델로 하는 개인모델의 국가군에서는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 정책 모델이 가족모델인 경우보다 개별모델인 경우 노동시장 접근에서 훨씬 성평등적이며, 노동시장 접근 수월성에 따른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권과 독립성 확보에 보다 성친화적(gender-freindly) 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독일오스트리아프랑스일본오스트레일리아스위스영국뉴질랜드미국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성 정책모델가족모델중립모델개인모델여성-남성 1) :비경제활동인구5546433632(30)263634(30)2524232317976주: 1) 25-54세 여성-남성2) 25-49세 기혼여성-남성3) 25-39세 최소 1명이상의 유아를 가진 엄마4) 주당 20시간 미만 근로자자료: Korpi(2000).기혼여성-남성 2) :비경제활동인구57474234363429-34-24-251915795성 격차(% 포인트)유아를가진엄마-남성 3) :비경제활동인구60435828534233-47-47553428168137단시간 근로자 4)218443334-11-2210213한편,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는 8개 국가의 빈곤율의 성격차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그림 5는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빈곤율의 성 격차가 가장 크고,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순으로 빈곤율의 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서 보듯이 이탈리, 네덜란드, 스웨덴은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의 비율이1배 가량으로 거의 빈곤율의 성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0 -
〔그림 5〕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201818.2161412.912.9 12.71210810.19.510.510.310.18.59.68.66.7여성남성65.24.9 4.8420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이탈리아영국스웨덴독일네덜란드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표 15〉 성별 빈곤율 비율: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1.41 1.34 1.29 1.28 1.19 1.02 1.02 0.9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한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가구구성, 고용상태 변수 값을 여성 평균값에서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의 성 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5개국 모두에서 고용변수가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은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가 10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간의 고용상태의 차이가 빈곤율의 성격차를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구성에서 한부모나 부모의 평균값을 남성 값으로 대체한경우에도 빈곤율의 성격차가 14-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이나 결혼상태는 남성 값으로 대체헤도 빈곤율 성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교육도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성격차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남녀간의 교육격차가 빈곤율의 성 격차로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표 16〉 빈곤영향 변수를 여성 평균값에서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 성 격차 감소비율변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연령 - - - - -저교육 - 10 - - 18독신 - - - - -부모 14 40 - 14 21한부모 24 30 14 14 18고용 100 100 100 71 71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131 -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빈곤율의 성격차가 거의 없는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빈곤율 성격차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빈곤율의 성격차가 거의 없는 좋은 성과를 나타낸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각각 어떠한 변수에의해 빈곤율의 성격차가 미미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스웨덴 값으로 대체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고용에서 현저한 감소율을 보였다. 역시 스웨덴은 남녀간의 고용 평등이 빈곤율의 성격차를 없게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결혼상태나 가구구성의 측면에서 빈곤율의 성격차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탈리아가 결혼상태나 가구구성 요인에 의해 다른 국가보다 빈곤율의 성격차가 낮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참여나 성과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한 관대한사회보장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표 17〉 빈곤영향 변수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 성격차 감소비율변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스웨덴 값으로 대체연령저교육독신부모한부모고용이탈리아 값으로 대체연령저교육독신부모한부모고용네덜란드 값으로 대체연령저교육독신부모한부모고용10na.---905-291429----10--10na30-1010020-803030-10--10--주: - 는 성별 빈곤율 격차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는 의미이며, na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없었다는 의미임.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na1414-100--1002929-14--14--5na--5575-431414----55--na35-1859--711826-3-181218-빈곤계층의 주류인 여성,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가 빈곤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될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높은 고용율과 함께 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풍부한 아동 및 노인보호서비스 등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들이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또한 빈곤의 성적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는 노동시장의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즉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성적 차원의 문제에 해법을 마련한 경우이다(Casper, MacLanahan- 132 -
and Garfinkel, 1994).또한 선진국들에서 공적연금은 (여성)노인의 빈곤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연금수급권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내에서의 보살핌노동기간을 연금기여기간으로 간주해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독일, 일본 등), 보살핌노동에 대한사회적 보상제도(carers' allowance 등)를 도입하거나(북구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하는 등의무급의 가족보살핌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현금보상으로 유급 노동(paid work)으로 전환시키는정책방안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성적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라고 판단된다.우리 나라가 여성고용 장려정책(노동시장), 가족보살핌 노동의 유급화(가족), 시민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 중 어떤 정책에 특히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정책의 성적 차원의 고려에 기반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곧 빈곤문제, 더 나아가 사회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할 수 있었으며, 빈곤의 성적격차의 심각성을 밝힐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탈빈곤이 이루어질 수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정책적 조치가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 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소득보장체계내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진다.이를 위하여, 첫째,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지원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괜챦은 일자리 (decent work) 마련, 여성 노동을 특징짓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둘째, 사회안전망(protective security)에서 노동계약에 기반한 기여(contribution)에서 시민권(citizenship)으로 수급자격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각종 영역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화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대 사회들에서 각종 가치 있는 활동들 및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분배를 지배하는 주요한 제도적 유형은 바로 ‘노동계약(labour contract)'이다.그러나 노동계약은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할당해 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적당한 보수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 질서 유지의 기초로서의 노동계약과 완전고용패러다임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초석으로서의 노동계약이라는 명제를 버려야 한다. 이에대한 대안은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 소득과 생- 133 -
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생존권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그가 노동자로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했기때문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야 할 권리이다(Offe, 1997). 실제로 네덜란드의 시민권에기반한 기초연금제도, 혹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권에 기반하지만 소득조사를 하여 일정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 연금을 통한 보편적 적용범위의 확보와 최저수준의 확보가 가능하여 기초보장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 모델은 결혼관계를 매개로 부여되는 현재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이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복지급여권을 갖는 것이며, 노동시장내 지위, 결혼관계내 지위 등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셋째, 빈곤은 물질적 빈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빈곤, 사회적 배제를 가져온다. 남성가구주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사별, 이혼, 질병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이미 단절된 사회적 네트웤으로 인하여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지원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의 복원, 사회적 자본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여성지원 네트워크의 조직화,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를 통한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등 정치권에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조직활동이 중요하다.또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위기개입과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의 확대- 先 보호 後 처리- 긴급급여대상자에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에 해당되는 “이혼‧사별 및 별거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항목을 추가함.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카드빚 혹은 사금융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항목에 추가.- 긴급생계급여의 급여수준의 확대∙ 생계급여상의 식료품비이외에 최저생계비상의 주거 및 교육비의 추가와 의료급여를 지원하며,급여의 지급기간을 현행 일개월에서 삼개월로 상향조정□ 미혼모 및 여성장애인가구들에 대한 지원강화- 현재 미혼모들은 시설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생계상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계속적인 생계‧보육비, 취업알선‧직업훈련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함.- 기초보장대상자 중 여성의 소득이 가장 낮으며, 이중 여성장애인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 여성장애인 가구들에 대한 가구특성에 맞는 생계, 의료급여 혹은 주거급여 등 개별급여 지원을 확대□ 차상위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지원확대-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차상위가구 및 모자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참여비율(현행 일부사업 40%까지 적용)의 확대- 134 -
- 모자가정에 지원되고 있는 학비, 아동양육비 지원의 현실화 및 추가적인 개별급여 지원모색∙ 기초보장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의 교과서‧부교재비용‧학용품비 신설이 필요함.∙ 배우자, 동거인 혹은 자녀중 건강상의 문제로 많은 의료비가 들 수 있음. 이러한 가구들에대해서는 개별급여로써 의료급여 지원방안을 모색□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교육 확대□ 여성가구주 가구 및 차상위 모자가정들에 대한 기초보장제도 홍보 강화- 초‧중‧고등학생 등에 대한 기초보장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강화□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탈빈곤정책개발- 장기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빈곤층 혹은 기초보장제도내의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정기적인 여성가구주 가구들에 동태 및 욕구조사 실시, 정부내 지속적인 여성탈빈곤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여성의 탈빈곤을 위한 계획수립- 여성수급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 여성 가구주 위기개입 상담 전달체계 확립 □ 자활후견기관의 대형화- 기본방향∙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여성자활후견기관을 설립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함. 교통이 좋은 대도시의 부심지역별로 대형 여성자활후견기관 건립- 여성 자활사업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종합적인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은 만큼 이러한규모의 획일화는 여성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특히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자활사업의 규모를 대상지역의 수요기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있음.□ 지원서비스의 종합화- 기본방향∙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 교육 훈련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함.∙ 육아, 방과후 학생지도 등 여성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 One-Stop서비스 체계의 구성- 보육서비스의 제공: 20대 후반부처 30대 중반이전 연령계층의 여성은 보육문제 때문에 대부분 조건부과제외자가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보육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들 연령계층이 자활사업에의 참여제약요인이 감소될 수 있음.- 간병서비스의 제공: 자활후견기관이 간병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이들 대상가능인력의 피간병자도 적극적으로 간병하게 된다면 개별화되어 있는 노동력을 집중화하면서 자활대상자도 사회화시키는 상승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초중고 학생을 위한 방과후 서비스의 제공: 대학생의 자원봉사와 대상중 고학력자 중심으로방과후 지도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응훈련 등 직업훈련서비스의 제공: 후견기관 규모를 대규모화 하게되면 직업훈련이나효율적인 훈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One-Stop서비스 체계의 구성: 다양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 135 -
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이 필요할 것임.□ 대상자간의 생활협동조합화- 기본 방향∙ 후견기관을 통하여 주거이외의 모든 니즈를 충족∙ 생활협동조합의 운영으로의 부의 유출 차단∙ 대상자간 협동생활 체계 구축∙ 공동구입공동소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은 상부상조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보다 나은 생활, 그리고 인간다운생활을 위해서 뜻을 같이하고 협동적인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민간비영리의 협동조직임.- 현재 생협은 탈빈곤운동의 형태가 아닌 환경운동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단위의 소비조합의 유형으로 빈곤문제의 해결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영구임대주택이라는 특수한공동거주지역에서 공동구매, 공동소비뿐만 아니라 단지내 상호 협동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후견기관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면 후견기관내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협동조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Co-op Business (가상)의 설립- 기본방향∙ 지원후견기관 직영의 회사를 설립∙ 기본적으로는 근로자파견회사 형태를 취함.∙ 모든 대상자의 사원화를 추진∙ 본 회사를 중심으로 사업단을 자회사화- 자활후견기관 자체 혹은 기관내 회사가 설립되고 대상자가 회사의 직원이 되는 형태를 만듦으로써 현재와 같이 대상자가 사실상은 일하면서 강요된 노동을 하는 식의 형식을 만드는 것을지양함. 현재 다양한 자활공동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아우르는 회사형태로는 근로자파견회사 바람직한 형태로 판단됨.- 이를 통하여 자활대상자는 일정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되고, 본인은 필요하다면 명함도 새겨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었을 대상자는 참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본 회사는 자활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차차상위의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듦으로써 차상위 이상의 계층이 빈곤으로 전락하는 길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Co-op Business에서 숙련된 근로자는 자력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이가능하게 될 것임.□ 전 대상자의 사원화- 기본방향:∙ 생계급여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함.∙ 임금의 지급방법은 최저임금+성과급으로 구성, 적극적인 노동유인을 제공함∙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전 업무를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될 경우 구성원도 자동적으로 사원이 될 것임. 사원이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들 사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임. 현재의 자활지원센터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만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에서의 탈피가 요망됨. 조건부 수급자의 개념이 아니라- 136 -
적극적인 노동참여자로서의 역할 조정이 필요함.- 만약 자활사업의 기초법에서의 독립화가 성공된다면, 임금을 지급하는 Co-op Business의활성화가 가능할 것임.□ 사회보험의 전면적 확대- 기본방향:∙ 자활대상자의 사회보험 가입∙ 산재보험에 우선적으로 가입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 후견기관예산에 대상자의 사회보험료도 함께 계상함.-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은 대상자의 안전보장은 물론 대상자의 자존감의 앙양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임.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노후의 빈곤을 막기 위하여국민연금의 적용확대도 필요함. 다음으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실제로 현실적 필요성과 사회보험적용 여건간에는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 따라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해서는 후견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하듯이별도 법인의 회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임.□ 단계적인 확대 필요- 기본방향:∙ 대도시 1개 지역에 시범사업∙ 기존 자활후견기관의 통합도 함께 고려∙ 사업성과에 따라 대상 후견기관 확대- 현재 전국의 후견기관은 획일화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후견기관의 적정성을 평가 할 수 있는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새로운 유형의 후견기관, 즉, 여성 특화 자활후견기관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인 사업시행이 필수적임.- 사업대상지는 여성대상자가 가장 밀집된 곳으로서 대도시 부심 내지 중심지로서 교통이 양호한 곳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시범사업은 가능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바람직 할 것임. 가. 단기적 개선방안□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범위 확대- 사업장가입자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에 집중 포진되어 있는 여성의 연금적용가능성을 확대함.□ 적용관리능력의 제고- 4대 사회보험간의 기능연계 및 통합을 통한 인력재배치를 통하여 관리가 어려운 영세사업장근로자와 영세자영자들에 대한 적용‧징수관리를 위하여 인력을 집중투입토록 함으로써 보장의사각지대를 최소화.- 일용직근로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모든 일용직근로자에게 ‘근로복지저축계좌’를 설정토록 하고,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금액의 일정률을 근로자 복지부담금으로 납입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 검토□ 임의가입의 촉진-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개별적인 연금수급권을- 137 -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임의가입을 촉진.□ 분할연금 수급조건의 완화- 연금분할 방식을 소득분할로 변경하여, 이혼 시점에서 혼인기간동안의 배우자별 소득 또는기여 기록을 분할하여 각자의 계정에 기록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혼 후 배우자이었던 자의사망 또는 장애와 같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분할연금수급권을 확보토록 함.-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모두 50%로 분할하는 방법을 고려함.- 연금분할을 연금분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혼시점)에 허용하여 이혼시에 연금가입이력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분할연금을 재혼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 분할연금수급권 요건에 필요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최저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분할연금 청구의 소멸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되, 청구 전 급여는 노령연금수급권자에게 귀속시킴.□ 연금크레딧제도 도입방안- 연금크레딧 적용사유: 임신‧출산, 육아, 개호, 병역 등 사회적으로 보상할만한 의미있는 활동에 대해 연금크레딧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함.- 연금크레딧 적용원칙: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가입간주기간 보장에 중점을 두되, 연금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금크레딧 적용은 연금급여산식 중 균등부분에만 기준하여 적용토록 함.또한 보험료의 대납주체는 사유에 따라 국가,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방부 등으로 설정함.- 임신‧출산, 육아과 같은 미래세대의 재생산은 연금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비경제활동기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험료 대납으로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함.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육아 등의 연금크레딧 최대인정기간은 4년으로 함(1자녀당 2년). 또한 이때 보험료 대납 기준소득은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급여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의 균등부분만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함.- 개호의 경우에는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그 제도에서 개호자의 연금보험료를대납하며, 보험료 대납의 기준소득은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급여산정시에는 해당기간의 균등부분만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함.- 병역의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병역의무자의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며, 보험료 대납의 기준소득은 평균소득의 50%로 하며, 급여산정시애는 해당기간의 균등부분만을 적용하여 급여를 산정함.나. 중‧장기적 개선방안1) 보완적 개선방안□ 유족연금 수급조건 합리화 및 급여수준 제고-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수급권 발생에서 장애 2급 수급권자로 제한한 것을 장애 3급 수급권자로 확대. 장애연금 등급기준개편과 소득활동여부 연계 검토. 유족의 범위설정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가 아내일 경우그 남편에 대해서는 장애 2급 이상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성차별적 요소를 철폐-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보다 상향조정하고 가입기간에 정비례하도록 변경하여, 10년 이하 가입자는 20년 가입기준 기본연금의 50%를 지급하고 11년부터 년당 1%p씩 올려 20년 이상은가입기간 비례로 노령연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장애2급 이상으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 자가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되면 수급권이 소멸하는현행규정을 소득활동 여부와 연계하여 수급권 소멸 결정이 바람직- 장기적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자녀양육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138 -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에 노령연금수급조건을 채우지 못한 피보험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 단기적으로는 처의 경우 수급기간을 3년 정도로 단축하고, 이 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게 하거나 직업알선을 한 후 취업을 통하여 가입자가 되도록함. 또한 현행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거나 장애, 가사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지급을 계속하도록 하되, 수급재개시 연령은 현행 50세에서 차차 60세로 상향조정함.- 현행 병급조정방식에 1/2노령연금 + 2/3 유족연금 조합급여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택종류를 3가지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 가급연금수준의 현실화- 노령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50%로 낮추고, 배우자연금을 주 연금(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기준으로 10~20%에서 정률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이에 따라 독신,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욕구에 따른 급여수준 합리화 가능□ 최저보증연금제도 도입방안- 최저보증연금은 표준소득월액 하한선의 현실적인 상향조정(1인 최저생계비 기준)이 먼저 정비된 이후에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기초연금과 최저보증연금제도는 대체로 대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된다면, 최저보증연금제도의 도입은 별도로 필요치 않을 수 있음.2) 근본적 개선방안□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및 국민연금의 다층연금체계로의 재구축 방안□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 현행 국민연금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한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어려움.따라서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기본틀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의 변화는 기존에 국민연금제도의 설계시 가정하고 있던 완전상시고용모형 및 남성의 여성부양모형에서 불완전고용모형 및 개별부양모형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변화된 경제사회여건하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함.□ 구조적 개혁의 기본방향-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경제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한 전국민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전국민 1인 1연금의 개별수급권 확보. 단, 상위 소득계층 20-30%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층연금체계의 구축: 1층은 조세방식의 보편적 기초연금, 2층은 보험료방식의 완전적립방식소득비례연금, 3층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기본구조-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상의 정액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여, 정액연금 부분은 수급대상을 전 노령계층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정립하고(단, 상위소득 20-30%는 수급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정율 소득비례연금은 소득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운영.- 첫째, 분배의 원칙이 적용되는 부분과 갹출에 비례하여 급여가 보장되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139 -
분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재구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 도모.- 둘째,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적 연대에 입각하여 연금제도를 통한 분배 메카니즘에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원칙하에 세대간․세대내 재분배를 적용받는 분배의형평성 확보.- 셋째, 소득비례연금은 본인의 기여대로 연금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투명한 제도를 구축.□ 대상- 보편적 기초연금: 전 노령계층(단, 상위소득 20-30%는 제외할 수 있음)- 소득비례연금: 소득활동자□ 급여수준- 보편적 기초연금: 근로연령계층 대비 노령계층의 부양구조, 근로연령계층 가처분소득 대비 노령계층 연금급여수준, 최저생활보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설정.- 소득비례연금: 확정갹출방식으로 운영. 갹출+이식의 총급여액을 평균여명 고려하여 연금액결정.□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보편적 기초연금: 추계에 의하면, 노인인구 비율이 8.3%인 2005년경에는 8조 1120억원으로GDP의 1%,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달하는 2050년경에는 576조 980억원으로 GDP의 5.5%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사회연대에 입각한 보편적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을 통한 세원 확보 필요.- 소득비례연금: 갹출 연금보험료의 적립방식 운영.□ 타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최후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에 대한 장애인수당, 노령수당(경로연금) 등의 예산이 절약되게 됨.□ 기대효과-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하여 연금 사각지대 문제의 근본적 완전 해소 가능.- 다층연금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기초보장의 충족과 다양한 욕구의 효율적, 효과적 충족 가능.세대내,세대간 재분배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적정보장은 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을 통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등 연금체계별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분리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제고. 다층화로 인하여 여건 변화에 대한 적응의 탄력성, 유연성 제고 가능.- 소요재원의 막대한 증가. 그러나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가되는 사회적비용을 국민연금제도를 통하여 떠안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140 -
․․. 2001. 『 : 』 .. 2002. “: ”. 『』 48.. 2002. “ ”. 『』 48.. 1997. “ “. 『』31.. 1999. “ ”. 『』 33().. 2001. “ ”. 『 2001 』.... 2001. 『 』. : .‧. 1999. “ ”. 『』3... 2002. 『 』. : ........... 2003. 『 』. : ... 2002. “: 1996~2002 2/4”. 『』74.. 2003. “ ”. 『』78.... 2003.『 』. : ‧.. 2003. “ ”. 『』56(2).. 2004. “ ”. 『』 24(1): 93-129.. 2002. “ ”. 『』 36(1).. 2000. “ ”, .. 2001. “ : , ?”. 『』18().. 1998. “ : ”. 『: 』. : UNDP ...... 2002. 『 : 』. : ... 2003. “ ”. 『』 19(1): 161-188.. 2003. “ : ”. .. 2000. “IMF ”. 『』 6.. 2002. “ : ”. 『』50.Benner, Johanna. 1987. "Feminist Political Discourses: Radical versus Liberal Approaches to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ndComparable Worth". Gender and Society 1(4): 447-465.Casper, Lynne M. Sara S. McLanahan. and Irwin Garfinkel. 1994. "The Gender-Poverty Gap: What We Can Learn from Other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4): 594-605.Even, William E. and Macpherson, David A. "Gender Differences in Pens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2): 555-587.Ginn, Jay and Sara Arber. 1991. "Gender, Class and Income Inequalities in Later Life".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2(3):369-396.Gornick, Janet C and Jerry A. Jacobs. 1998.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5): 688-710.Hill, Dana Carol Davis and Tiggs, Leann M. 1995. "Gendering Welfare State Theory: A Cross-National Study of Women's Publicpension Quality", Gender and Society 9(1): 99-119.Korpi, Walter. 2000.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s",Social Politics, Summer 2000: 127-191.Lewis, J.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Millar, J. and C. Glendinning. 1987. "Invisible women, Invisible Poverty". in C. Glendinning and J. Millar (eds.). Women andPoverty in Britain.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Millar, J. and C. Glendinning. 1989. "Gender and Poverty". Journal of Social Policy 8(3): 363-381.Millar, J. 1996. "Women, Poverty and Social Security". in C. Hallett ed. Women and Social Policy: an introduction. London:Prentice Hall; Harvester Wheatsheaf.O'Connor, J.S. 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501-518.Orloff, A. 1996. "Gender in the Welfare 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51-78.Orloff, A. S.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The Comparative Analysis of Gender Relations and the WelfareStat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3): 303-28.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 .28-36.Pearce, D. 1983. "The Feminization of Ghetto Poverty". Society 21: 70-74.Peterson, J. 1987. "The Feminization of Poverty". Journal of Economics Issues 21.Rake, K. 2001.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cies". Journal of Social Policy 30(2).Sainsbury, Diane.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Sainsbury, Diane (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Sen, Amartya. 2000. Social Exclusion: Concept, Application, and Scrutiny. Social Development Papers No.1, Office ofEnvironment and Social Development. Asian Development Bank.Stahlberg, Ann-Charlotte. 2001. Gender and Social Insurance: Lesson from Europe, World Bank: ASEM project on Social Policy.- 141 -
〈부표 1〉여성가구주(20~64세) 유형별 기초통계(가구소비실태조사)(단위: %)구분 1) 1.0 이하 1.0~1.5 1.5~2.0 2.0 이상가구주연령(hage)30세 미만30~39세40~49세50~59세60~64세3.111.910.413.525.08.516.415.515.725.212.115.914.917.217.376.455.859.253.732.5가구주교육수준(hedu)초등학교 이하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이상20.412.19.43.11.722.820.112.28.83.417.119.614.115.56.339.848.164.272.688.5가구주결혼상태(marry)미혼기혼이혼사별3.4510.215.318.67.216.418.819.113.915.315.316.975.558.150.645.4가구주취업상태(work)상용직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자영자무직3.49.36.023.97.917.912.518.710.320.013.413.178.452.868.144.4가구주종사산업(ind)제조업건설업도소매판매업음식숙박업전기가스및운수통신업금융보험 및 부동산업기타서비스업농림수산업7.80.07.37.57.04.36.324.318.920.213.115.27.68.711.919.415.619.214.720.89.39.116.112.857.760.664.956.676.177.965.643.5가구원수(hnum)1인2인3인4인 이상13.59.512.012.113.114.616.420.713.016.716.216.660.459.355.350.7가구내취업자수(hwnum)없음1인2인 이상27.910.11.520.017.09.111.516.716.040.656.273.4가구유형(type)독신가구부부(+미혼자녀)가구편부모가구기타가구13.514.89.510.313.118.616.814.813.019.515.614.960.447.257.960.0주: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0배, 1~1.5배, 1.5~2배, 2배를 의미함.- 142 -
〈부표 1〉계속구분 1) 1.0 이하 1.0~1.5 1.5~2.0 2.0 이상자녀연령(sage)0 ~ 5세6 ~10세11~15세16~19세기타8.916.016.212.67.415.221.722.218.915.022.918.315.114.417.053.043.946.554.060.6부모봉양(oage)75~79세80세 이상기타11.722.77.026.120.011.77.520.219.254.737.162.1가구거주지역(1)특별시, 광역시비광역시9.114.914.017.516.214.560.753.2가구거주지역(2)(area2)서울인천‧경기‧강원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대전‧충청광주‧전라‧제주6.511.813.316.014.714.612.115.617.115.818.518.212.812.316.421.918.917.968.660.353.346.347.949.3가구주거형태(htype)자가전세월세기타13.77.211.87.117.011.916.411.116.311.419.111.953.169.552.769.8공공부조수급여부수급가구미수급가구38.210.142.014.010.915.78.960.2공공부조이외수급가구미수급가구23.610.319.015.217.915.139.559.4사회보험수급여부수급가구미수급가구8.611.915.015.616.115.460.357.1주: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0배, 1~1.5배, 1.5~2배, 2배를 의미함.원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2000.- 143 -
〈부표 9〉여성가구주(20~64세) 유형별 기초통계(자활조사자료)(단위: %)구분 1) 1.0 이하 1.0~1.5 1.5~2.0 2.0 이상가구거주지역(1)대도시 동지역중소도시 동지역읍‧면지역6.67.415.55.56.817.25.05.010.483.080.856.9가구원수1인2인3인4인 이상15.76.72.40.912.66.54.53.57.06.93.84.464.779.989.391.3가구형태일반가구부부가구모자가구부자가구단독가구기타3.913.84.80.016.23.42.63.79.60.012.44.72.90.014.00.06.93.290.682.571.6100.064.588.7기초보장수급여부비해당일반수급자조건부수급자특례수급자기타6.931.110.216.80.07.118.222.811.20.05.214.69.19.229.580.736.157.862.870.5의료급여수급여부비해당1종2종6.941.717.97.119.118.05.415.310.380.623.853.7가구주거형태자가전세월세무상8.57.48.112.79.65.07.612.26.62.56.114.075.385.278.261.2기러기가족유무우우기러기가족없는 경기러기가족있는 경8.74.68.33.16.22.376.890.0가구주 연령30세 미만30~39세40~49세50~59세60~64세5.33.46.37.725.64.24.46.99.317.12.78.06.65.37.387.884.380.377.750.1가구주교육수준초등학교 이하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이상15.36.24.87.53.514.28.24.03.23.6주: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0배, 1~1.5배, 1.5~2배, 2배를 의미함.8.46.55.84.60.462.179.185.484.892.5- 144 -
〈부표 2〉계속구분 1) 1.0 이하 1.0~1.5 1.5~2.0 2.0 이상가구주결혼상태미혼기혼이혼사별별거5.34.16.113.35.74.12.910.211.17.32.51.67.88.47.588.091.475.967.179.5가구주취업상태상용직임금근로자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자영자자활‧공공근로무직0.03.26.10.022.30.06.89.034.610.62.57.43.617.96.297.582.581.447.660.9가구주직업전문가사무직서비스‧판매농어업기능원장치‧기계단순노무직비해당0.60.02.814.60.020.24.122.31.30.03.725.84.30.012.710.61.20.04.35.710.60.010.76.296.9100.089.254.085.179.872.560.9장애여부있음없음34.97.18.37.912.85.644.079.3만성질환여부있음없음20.05.016.15.510.84.553.185.0연금가입여부비해당있음없음21.44.97.520.54.17.66.54.37.551.786.777.3산재보험가입여부비해당있음없음20.00.26.69.63.510.85.66.65.664.989.777.0고용보험가입여부비해당있음없음18.80.04.510.81.37.86.45.95.764.092.882.0건강보험가입여부비해당있음없음25.86.90.018.47.10.012.05.346.743.880.753.3주: 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의 1.0배, 1~1.5배, 1.5~2배, 2배를 의미함.원자료: 자활조사자료, 2002.- 145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여성:토론1(별첨)토론자 : 정지현(불안정노동철폐연대)- 146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여성:토론2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빈곤현황과 정책과제김안나(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성 인지적 관점에서 본 빈곤현황과 정책과제’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빈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현상에 대해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그 실태와 원인을 잘 보여주고 있는 논문이다. 또한 외국사례가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으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활지원제도․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다음은 전반적인 논의과정에서 좀 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 논문의 서술구조에 따라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먼저,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빈곤 개념과 이후 제시되는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태분석과의 연관성 문제이다. 앞에서 제시한 여성빈곤의 개념적․이론적 틀, 성 통합적 관점에서의 빈곤에 대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여성빈곤의 실태를 분석하여 연계고리를 더욱 부각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두 번째로는 빈곤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변량분석에 대한 것이다.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를 구분하여 빈곤영향을 분석하는 표12에서 독신가구와 비교했을 때 편부모가구에 대한 영향은 남성과 여성가구주 각각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구주일 경우 편부모가구일 때 독신가구에 비해 빈곤이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만을 살펴본 표13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부부가구와 대비했을 때 편부모 가구주 여성가구주일 경우 빈곤이 9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제껏 한부모 특히 모자가구일 경우 빈곤의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세 번째로는 여성빈곤 극복의 가장 근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인 여성고용정책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타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strong>빈곤과</strong> 비빈곤을 가름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는 상용직 종사여부이다. 이는 곧 고용확대정책을 통한 빈곤극복대책의 토대가 된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제도적 차원,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제도, 연금제도 등 여성빈곤 극복대책마련을 위한 제도적개선에 집중함으로써 빈곤예방 차원에서의 노동정책과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 같다. 참여정부의 강력한 사회정책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사업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 안정적이고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괜챦은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본 논문에 덧붙여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좀 더 고민해 본다면 다음과- 147 -
같은 정책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업훈련과 안정적 직업을 통한 소득보장지원책이 필요하다. 여성가장실업자 직업훈련대상자를 확대하여 좀 더 많은 빈곤여성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훈련기간 동안 지급되는 훈련수당을 현실화하여직업훈련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과 이후 종사하게 될 직업과의 원활한 취업연계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고용안정센터, 여성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또다른 중요한 지원체계는 이러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이 될 수있다. 무보증소액대출사업(Microcredit)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사전․사후 컨설팅(적합업종 선택, 사업계획 수립, 교육훈련, 자금지원, 안정적 수익구조 창출)등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창업성공률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책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빈곤여성을 위한 또다른 중요한 지원책 중의 하나는 사회․심리적 지원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이혼․사별 후 겪게 되는 환경변화로 인한 여성 및 자녀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가족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위기개입의 ‘선보호 후처리’ 방안과 함께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관계형성 프로그램등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여성의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원은 여성전담 전달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빈곤여성을 위한 특화된 상담과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독자적인 여성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여성지원센터로 하여금 지역사회 내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빈곤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148 -
- 지방자치와 빈곤을 논할 때, 두 가지 어려움이 존재함. 첫째, 지역별 빈곤율 등 지역별 빈곤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움. 둘째, 아직까지 지역복지운동의 경험이 실천적으로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기에 어려움.- 이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빈곤실태에 대한 지역별 통계가 시급히 필요함.-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의 확대(실질적 지방자치로써 주민자치의 확대)라는 과제와 빈곤 문제 해결(폭넓은 의미에서 지역복지의 확대)이라는 과제 모두를 언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자체수입 + 의존수입*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양여금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2005년 현재, 지방양여금 폐지)* 지방채 발행- 재정자립도란 전체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의 비중을 말함.- 149 -
-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3년 이후 조금씩 회복하고 있음.[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연도별전국평균(순계규모)특별시광역시(총계규모)도(총계규모)시(총계규모)군(총계규모)자치구(총계규모)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62.263.063.459.659.457.654.856.357.289.989.490.081.884.882.979.882.281.443.142.542.138.337.935.634.639.441.353.453.354.152.050.643.440.238.038.822.521.222.923.422.018.117.416.316.653.051.649.752.346.945.045.142.342.6․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 분포현황을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10%인 곳이 250개 지자체에서 10개나 되며, 대부분의 경우10~50% 사이에 머물고 있으며, 70~100% 사이에 속하는 지자체가 단 11개에 불과할 뿐임.[단체별 재정자립도 분포 현황] 비율단체수합 계 구성비 시‧도 시 군 자치구(%)합 계 250 100 16 77 88 6910%미만10~30%미만30~50%미만50~70%미만70~90%미만90%이상1012683207445033832-71341-3230141-10726----1546323․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 이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조세체계가 국세 중심이기 때문임. 재정자립도를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국세와 지방세 항목을 조정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임. 둘째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임.-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보다 더욱 큰 문제는 지역간 재정불균등이고, 지방세 비중을 높인다고 재정불균등을 해소할 수는 없음. 지방세 비중의 확대는 오히려 지역간 재정 불균등을 심- 150 -
화시킬 수 있음.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자칫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 실행을 야기할 수 있음.-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보다는, 지역간 재정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간, 도시와 농어촌간 재정불균등이 심각하다는 것임.- 2004년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94.5%(최고)인데 반해, 전남 신안군은 7.1%(최저)에불과한 실정임.- 광역시별로 보면, 부산이 72.7%인데 반해 광주는 54.6%에 불과하고, 시도의 경우는 경기도가78.0%인데 반해, 전라남도가 14.2%에 불과하는 등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매우 심각함.[단체별 최고‧최저 재정자립도 현황]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평 균 94.5 68.8 41.3 38.8 16.6 42.6최 고최 저94.5(서울)-72.7(부산)54.6(광주)78.0(경기)14.2(전남)․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70.4(성남)12.3(삼척)48.6(울주)7.1(신안)92.7(서울 중구)19.4(광주 남구)- 151 -
[재정자립도 시․도별 현황]시‧도별시‧도별평균(순계규모)특별시광역시(총계규모)도(총계규모)시(총계규모)군(총계규모)자치구(총계규모)단체별평균 57.2 81.4 41.3 38.8 16.6 42.6서 울95.594.5---50.3부 산75.672.7--42.536.8대 구73.271.4--33.034.0인 천75.970.8--20.838.3광 주59.854.6---26.8대 전74.469.6---34.4울 산69.665.8--48.638.1경 기78.8-78.052.021.3-강 원28.9-24.226.717.3-충 북31.3-26.235.318.1-충 남30.5-26.229.218.4-전 북25.9-18.926.814.3-전 남21.1-14.229.611.4-경 북29.4-22.330.515.0-경 남38.3-34.136.214.4-제 주34.7-29.130.217.7-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주:1. 시‧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됨에 따라 단체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중복계상분을 공제)2.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의 단체별 재정자립도는 순계규모로 산출이 곤란함에 따라 총계규모로산출.- 이러한 현상은 자치구에서도 발생함. 서울시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 동안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93.2%인 반면, 성북구는 30.0%에 불과함. 같은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간 재정불균등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남.- 152 -
[서울시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단 체 명 2001 2002 2003 2004 단 체 명 2001 2002 2003 2004합 계 95.6 95.6 95.9 95.5 은 평 구 31.2 31.1 29.1 30.9시 본 청 94.9 94.7 95.1 94.5 서대문구 39.1 42.3 38.8 39.6자치구계 52.4 52.9 49.1 50.3 마 포 구 46.7 44.7 38.5 40.6종 로 구 72.3 75.7 70.4 68.2 양 천 구 58.2 60.4 42.9 44.6중 구 95.0 93.0 91.9 92.7 강 서 구 44.0 45.6 41.4 43.8용 산 구 51.8 52.8 45.9 53.0 구 로 구 45.5 43.4 40.6 39.3성 동 구 42.2 41.0 38.0 34.5 금 천 구 37.6 39.7 36.2 32.9광 진 구 42.3 39.0 37.3 37.6 영등포구 78.8 81.9 72.4 73.5동대문구 37.0 38.8 34.5 36.4 동 작 구 39.2 41.7 42.0 43.3중 랑 구 35.1 32.0 30.3 30.3 관 악 구 31.4 32.6 31.3 33.1성 북 구 43.7 44.5 44.6 43.1 서 초 구 91.4 90.5 89.8 91.4강 북 구 30.4 31.8 30.0 27.9 강 남 구 90.8 87.7 87.6 91.4도 봉 구 37.6 37.4 35.1 38.3 송 파 구 68.4 67.4 62.9 74.1노 원 구 33.5 33.2 30.1 29.5 강 동 구 41.8 43.3 41.3 41.2․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 -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참여는 부분적으로 각종 위원회, 인터넷, 공청회 등을통한 부분적인 의견 수렵에 그치고 있음.- 지방자치제도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배제된 채,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방권력의 주민통치로 전락되어 있음.- 특히 고질적인 지역구도 때문에,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권력의분산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153 -
[2003년 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결산] 단체별장관별합계 비율(%)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일반행정일반행정 14,422,283 14.58 992,400 2,218,003 4,709,091 2,925,927 3,576,862입법및선거관계 377,191 0.38 44,121 59,075 103,600 72,323 98,072교육및문화 9,985,555 10.10 4,362,181 2,923,459 1,694,985 809,331 195,599보건및생활환경개선 9,829,306 9.94 1,167,737 2,042,826 3,448,035 1,683,677 1,487,031사회개발2,435,709 2,741,866 2,709,781 1,325,041 2,119,564사회보장 11,331,961 11.46(11.56) (10.30) (10.66) (8.30) (21.54)주택및지역사회개발 6,624,724 6.70 966,254 1,311,534 2,296,650 1,739,241 311,044농수산개발 8,319,650 8.41 273,492 3,199,966 2,158,157 2,611,728 76,307경제개발지역경제개발 3,180,271 3.22 669,973 1,040,985 809,592 495,691 164,031국토자원보존개발 19,342,235 19.56 2,463,430 6,536,452 5,581,890 3,589,413 1,171,050교통관리 2,989,415 3.02 1,557,798 407,012 767,452 177,811 79,343민방위민방위관리 228,579 0.23 35,118 32,085 101,667 28,629 31,080소방관리 1,581,035 1.60 704,465 856,688 2,366 17,517 -지방채상환 1,715,871 1.73 953,210 253,980 342,703 118,686 47,293지원및기 제지출금 281,992 0.29 6,331 28,641 122,387 67,401 57,231타교부금 6,902,344 6.98 4,178,523 2,723,821 - - -예비비 1,786,216 1.81 250,747 248,930 569,316 292,159 425,064합계 98,898,628 100.00 21,061,487 26,625,324 25,417,670 15,954,575 9,839,571․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2004년- 주요 용어 설명□ 일반행정비 :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교육문화비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 교육관리비용과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비용□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 보건소운영, 질병예방사업, 환경개선, 공원관리 등□ 사회보장비 :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보호 등 사회보장관련 예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 주거환경개선, 지역개발, 도시계획관리 등□ 지역경제개발비 : 지역산업활성화, 과학기술․투자진흥, 고용정책관련 예산□ 국토자원보존개발비 : 산림, 건설, 도로관리, 재해대책 관련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사회보장비의 비율은 최근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중앙 정부 재정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함.- 그러나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2003년 지방자치단체별 일반회계 세출의 기능별 결산을 보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19.56%), 일반행정비(14.58%), 사회보장비(11.46%), 교육및문화(10.10%) 등의 순서로 지출이 이루어짐.- 사회개발비를 넓은 의미에서 복지지향의 재정지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회개발비 전체를 복지지향의 지출로 보기는 어려움. 교육문화비에는 문화, 체육, 관광 관련 비용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는 환경개선, 공원관리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도 지역개발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주거복지 관련한 예산으로 보기 어려움.- 사회보장비 역시 중앙위임사무에 대한 매칭펀드로 발생하는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독자적인 복지 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54 -
- 더욱 큰 문제는 사회보장비의 지역간 격차임. 지역주민행정이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간에 큰 차이가 있음. 시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10.66%이고, 군은 8.30%인데 비해,자치구는 21.54%임. 이는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 지역간 사회보장비 지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최근 들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방향이나 계획은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계획과 거의 유사하며, 지역의 상황과 실태를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맞는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는 못함.-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가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의행정집행기관에 머물러왔기 때문임. 향후에 지방자치라는 이름에 맞게 지역복지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노무현 정부가 의욕있게 추진하는 지방분권화 정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정분권임.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정비하여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양 대상사업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총533개의 국고보조사업(12.7조) 중에서 142개 사업(9580억원)을 지방이양 대상으로 삼고 있음.- 지방이양 대상사업 142개 중 사회복지 분야는 67개이며, 금액으로는 5,988억원임.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일컫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4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며, 이는 전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의 54%에 해당함.- 155 -
[2005년 사회복지사업 중 지방이양 대상] ․ 자료출처: 행정자치부.- 이에 대해 우려되는 바는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큼 : 많은 지방자치단체가관할지역의 경제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중시해, 복지정책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 156 -
2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총인구대비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비율복지사업 지방비 부담액재정자립도순위 지자체 비율 순위 지자체 부담액 순위 지자체 자립도1 전남 6.83 1 서울 4,445 1 서울 95.52 전북 5.85 2 경기 2,231 2 경기 78.83 경북 4.40 3 전남 1,451 3 인천 75.94 충남 4.18 4 경북 1,376 4 부산 75.65 강원 3.83 5 부산 1,337 5 대전 74.46 제주 3.75 6 전북 1,321 6 대구 73.27 충북 3.56 7 경남 1,255 7 울산 69.68 광주 3.51 8 충남 999 8 광주 59.89 경남 3.20 9 대구 800 9 경남 38.310 부산 3.05 10 충북 774 10 제주 34.711 대구 3.04 11 강원 765 11 충북 31.312 대전 2.63 12 인천 632 12 충남 30.513 인천 2.20 13 광주 620 13 경북 29.414 경기 1.85 14 대전 446 14 강원 28.915 서울 1.72 15 제주 380 15 전북 25.916 울산 1.53 16 울산 333 16 전남 21.1평균 2.89 합계* 15,866 평균 57.22004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비교(단위 : 억원, %)자료 : 보건복지부 및 행정자치부 내부자료출처 :「2005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지역간 불균등 발전을 일정하게 반영함.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빈곤율이 높을 가능성이 큼. 지역 빈곤율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빈곤실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임.-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가장 높으며, 국고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이 3위를 차지함. 이는 그만큼 재정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예산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축소를 가져오게 됨. 이것은기초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 때문에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정 악화요인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특히 취약- 158 -
계층에 대한 소득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현행의 매칭펀드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사업의성격에 따라 전액 국비 사용, 차등보조율 적용 등의 방식이 가능함.-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생활최저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 차등보조율 법적 근거관련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보조금법시행령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조항“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 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있다.”“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적용할 수 있다.”“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각각 차감하여 적용”“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종목 등)있다.”3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역량 ․ 복지마인드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역량과 마인드가 부족함.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지방이양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많은 경우 이런 점에 기인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력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복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강화를 유도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복지기능을 주된 존재 이유로 삼아야함.- 159 -
-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구체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함. 특히, 지방자치가 확대될 때 우려되는 자치단체장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활동 강화와 주민의참여가 전제되어야 함.※ 스웨덴 사례․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작은 단위인 시정부 혹은 기초자치구 정부와, 군정부 혹은 광역자치구 정부가 있음․ 기초자치구는 현재 289개로서, 그 주요 기능은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임(대학을 제외한 모든 교육 제공, 아동보육, 생활보호,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가족상담, 환경 및공중보건 등을 제공).․ 1997년 현재 기초자치구 예산의 70% 이상을 주민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쓰고 있음(사회복지서비스 지출비의 비율 40%, 교육에 대한 지출 27%, 환경 및 보건에 대한 지출 5∼6%)․ 1998년 현재 기초자치구의 피용자 중, 노인복지 및 보건에 33%, 보육에 18%, 그리고 교육에22%, 행정담당 9%임.․ 현재 2개의 지역자치구를 포함하여 20개로 이루어진 광역자치구 정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주로 담당. 광역자치구 정부는 1997년 현재 총예산의 85%를 지출, 이 가운데지방세 수입이 77%, 국고보조금이 9%, 의료서비스 이용자 부담분이 4%를 차지. 의료서비스제공 외에도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의 업무 담당.1 주민 자치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의 대전제는 주민 자치의 강화임.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주민소환제도, 주민투표제도의 실질적 강화-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시 주민투표제 근거 마련 후 후속법률이 미제정 되었다가 2003년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였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됨.-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예외사항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만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실현이 힘든 주민투표 청구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음. 그 결과 주민투표제도는 형식적인 제도가 되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힘들게 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리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전횡을 자행하는 경우에 임기중이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그 직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recall) 제도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 주민이 소송을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예산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민소송제임.- 이러한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분권의 필수요소로서 그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 160 -
조되어 왔음.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에 도입방안을 강구하도록 명기했을 뿐 전면적인실시는 불투명한 상황임. 또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도 청구권자의 숫자에 제한이 많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미미한 수준임.-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을 통해 지방권력의 통치로 변질되어 있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인 주민자치로 나아가게 해야함.○ 참여예산제 실시- 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한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동의의 단계와절차를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임.- 현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작성한 ‘참여정부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서 참여예산제도 도입계획을 밝히고 있고,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정운영과정에 대한 국민참여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참여예산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도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을 제시하고 있음(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안 제40조(지방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입법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률정비 필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추가 검토를 통해 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의 개정과 제정을 고려해야 함. 또한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재원의 지자체에 배분함에 있어 지자체별 참여예산의 실천정도가 중요한 배분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참여예산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법개정)도 고려해야 함.- 투명성 지수 개발 : 예산 투명성 확보의 핵심기제를 정보의 공개와 참여라고 했을 때, 지방의회와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공개와 참여 정도를 ‘투명성 지수’로 개발하여 지방재정분석·진단에 활용하고, 중앙재정 배분기준으로도 사용하는 방안 모색할 필요 있음.- 실천활동을 통한 참여예산의 유의미성 경험 필요: 미흡한 수준이지만 참여예산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참여예산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대다수 주민들은참여예산에 대한 기본적 이해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참여예산에 대한 실천활동은관련 법·제도의 정비 요구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 요구 투쟁을 통해참여예산의 유의미성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지역별로 지역 주민의 여론를 반영한 삭감·증액대상 사업 선정 발표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임. 현재 지자체 자주재원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참여예산의 대상은 예산 전체가 아닌 투자사업 중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없을 것임.- 원칙(재정민주주의)과 현실(지자체 자주재원 부족, 시민들의 예산 이해 수준 저조, 역할 및 권한축소에 따른 지방의회와 행정조직의 저항 가능성 등)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예컨대 주민들의 복지마인드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참여예산제가 지역복지예산을 증가시- 161 -
키기보다 지역경제개발예산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음.2 지방의회의 전문성 및 활동 강화- 현재 지방의회의 주요업무는 조례 제정과 행정 및 예산 감사임. 앞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전횡을 휘두르지 않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있도록 감시, 통제,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주민들에 참여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에, 의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할 것임.○ 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현재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정도임.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 통제 기능이 매우 취약. 지방분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될 때 이를 감시, 통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 및 전문성 역시 함께 강화되어야 함.- 권오성(2003)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3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은 예산최종안이 지방의회에 의해서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더 큰 영향력을 받는다고 응답함.[지방자치제에서 예산 최종안에 대한 영향력]단위응답지방의회 2지방자치단체장 33거의 같다 0합계 35- 예산최종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실질적 심의에 대한 견해에서도 35개의 응답 중 23개의 응답이실질적인 심의를 수긍하고 있지만, 단지 3개의 응답만이 지방의회의원의 지방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강한 회의를 나타냄.- 162 -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대한 평가]만족도 실질적 심의를 한다. 전문지식이 있다.매우 긍정적 4 0긍정적 19 3보통 5 17부정적 7 15매우 부정적 0 0합계 35 35- 향후, 지방의회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도 매우 시급한 문제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지방의회내에 의원들의 조례발의, 예산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부서 설치. 둘째, 유급 정책보좌관 신설 등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이와 함께 지방의회 조례제정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감사를 강화해야 함. 감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업무에 대해서는 권고를 넘어서는 탄핵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필요가 있음. 또한 의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서 독립시킬 필요가 있음.3 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공 ․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축)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대응 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내 공공․민간의 복지공급자․수요자간의 연계․협력기구로 2003년법제화되어 2005년 7월에 실시 예정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거나, 민에 의해주도되는 가운데 관이 무관심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됨. 민관이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한 심의기능을 넘어서 지역복지의 방향과 계획 전반을 입안,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유지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음. 속칭 복지마피아라불리는 토호세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자신의 세력을 키우거나 치부의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견제, 감시, 참여를 해야함.- 163 -
- 주민자치의 강화, 지역복지의 강화는 전적으로 지역복지운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개되느냐에달려 있음.- 지금까지 지역복지운동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과 지역의 복지 자원이 열악한 시․군 단위의 지역복지운동은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시피함.- 향후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복지운동을 활성화해야 하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노동당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큼.- 지역 차원에서 복지 관련 단체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역 차원의 복지운동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 궁극적으로 지역 자체의 변화를 위한운동에 돌입해야 함.- 또한 지역복지운동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예를 들어 전국적 지역복지운동 네트워크의 주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과 정책을 비교,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부각시키고 지역복지의 확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임.- 164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지방정치:토론1지역차원의 빈곤운동은 지방권력을 바꾸고,자치행정의 기본가치를 바꾸는 운동이다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지역별 빈곤실태의 미수립과 중앙차원의 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주먹구구식 지방빈곤정책 집행은 제대로 된 평가와 대안마련을 할 수 없게 함 : 종합적인 빈곤정책의 실종.- 지역복지운동의 미성숙은 빈곤관련 의제를 지역의 제 시민사회운동에 제대로 투영시키지 못하고있음 : 지방정부는 빈곤정책을 부수적인 정책과제 정도로 인식하고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제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음.- 빈곤예산의 확충을 막는 걸림돌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간 재정불균등 제시 : 해소가 급선무지만, 경제활성화에 모든 행정 집중 현상으로 나타남.- 주민참여가 배제된 일방적 지방관료행정, 자치단체장의 권한집중, 민주적인 시민사회 통제시스템의 부재, 부패구조의 만연 등 지방권력의 분산과 견제 필요성이 대두되나 실질적인 주민참여시스템이 없음으로 인해 빈곤문제 해결 난항.- 지방행정의 존재 근거, 임무, 기능, 역할을 재검토 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역량의 미흡, 재정분권화 정책 시행, 지역복지계획 수립 등 복합적 상황 연출로 갈팡질팡. 1 중앙정부의 과제 :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과 국고보조사업의 매칭펀드 방식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국비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력에 대한 수급도 지방이양시킬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강제해야 함.2 지방정부의 자치복지강화의 과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5년부터 구체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범기초자치지역과 비시범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다보니 시범지역도 아직 제대로 된 방향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비시범지역은 눈치만 보고 있음). 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역할에 대한 지방의 복지정책역량이 미흡함. 또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2007년까지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현재 제대로 추진하는 곳은 거의 없음.- 165 -
- 실질적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주민발의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제도의완화와 주민소환제와 주민소송제 도입 등으로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 참여예산제의 도입과 조례제정을 통한 예산의 투명성 확보3 지역복지운동의 강화을 위한 제안-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현실인식과 이로 인한 전국적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미약.-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워크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과 정책감시 제안. 1 사회복지공공전달체계 변화 추진 우려- 참여정부는 매년 1천5백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충원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있음.- 최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800명 충원을 발표한 바 있으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기존의 공무원들을 전환하는 등 실질적 인력확충은 회피.- 시범 사회복지사무소(2004년 7월)를 폐지하고 시, 군, 구 사회복지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 인력의 문제와 맞물려, 전문성 및 접근성 문제 대두, 시범사업 백지화 우려2 재정분권화에 따른 우려-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예산배분의 불평등 심화, 복지영역 내 배분의 불평등 강화, 지역격차 심화.- 복지수요 폭증에 따른 공공전담인력 확충 어려움 : 전담공무원 인건비 지방이양.- 향후 총액인건비 지원제도가 추진되면, 지방정부는 더욱 더 공공복지인력 확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전담공무원보다 담당공무원제 선호, 행정직의 권한 강화, 비전문가에 의한 서비스질 하락.- 지방행정과 복지권력과의 지배블럭 강화 및 부패구조, 예산편중 : 빈곤예산 투입여력 없음. 1 주민참여와 행정의 민주적 통제 메카니즘의 강화 : 복지행정만 변화시킬 사항이 아니라 지방행정 자체의 개혁 필요, 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제화, 빈곤문제를 지역복지운동단체만의과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과제로 전면화시킬 수 있음.- 지방행정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이념과 철학, 가치를 새롭게 정립,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지방정부가 경제나 개발에 집중.- 166 -
- 자치단체장에게 집중화된 권력구조 분산 : 지방행정의 집행 축은 국이나 과 단위로 이루어질 수있도록 인사, 예산, 조직권 위임.- 지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 단순반복, 전문인력에 의한 업무구조 재설계 필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 : 행자부 기본조례안 예시, 시민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의 예산편성안에 대한 의견제시, 주민의견 수렴, 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편성과정에 참여, 예산낭비요소차단과 예산 확충을 통한 빈곤예산 일정비율 확보. 복지예산 확충의 필요성 시민사회 전면화유리(제기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야 함).- 시민정책토론청구제의 도입 : 시행정책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토론을 청구할 경우 토론회 개최(예 : 청주).- 위원회제도 개선 : 유명무실 위원회 강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위원회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원천적 보장(조례제정시), 특정인의 위원회 중복 참가 배제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위법 재개정 :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소송법 개정, 주민소환제 제정.2 복지마피아(재벌)와 행정의 카르텔 붕괴- 복지마피아나 재벌에 의해 행정이 포섭된 지방정부 : 민주적 의사절차가 거의 없는 상황, 행정과의 유착, 예산배분의 형평성․공정성 시비, 빈곤예산에 대한 확보 등 사회적 접근보다는 예산배분의 심각한 불균형만 초래하여 빈곤예산 확충을 막을 수 있음.- 재정분권화에 의해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 현재 빈곤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예산과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임, 재정자립도가낮거나 중소도시 또는 농어촌의 경우는 더욱 집중되어 있음.-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집중에 따른 배분의 민주적 통제 메카니즘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가 만연된 사회복지시설(예, 대구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청암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사건) : 비리재단을 중심으로 한 몇몇 복지재벌들과 복지행정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전면전 양상.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빈곤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전면화시키기 어려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통제시스템 도입- 시설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통제 : 시민사회의 적극 참여 보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통제 : 민주적 이사회 운영과 공개, 법 위반시 행정의개입 권한 확대, 운여이사와 시설장 겸직 불허(소유와 경영 분리).3 지역복지기본계획 수립과 지역복지협의체 감시운동 : 자치단체의 책임성 강제- 지역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복지환경에 대한 정밀한 실태조사 요구 및 감시 : 지역빈곤 실태조사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강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광역자치단체가 수합, 이후 광역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동시에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초단체와 협의하면서 수립하도록 강제해야 함 :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손놓고 있음.- 지역복지협의체는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활동장이 될 수 있으며, 이해를 같이 하거나 밀월(?) 관계에 있는 일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지역복지협의체를 장악하기 위한 각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 필요.- 복지부의 지역복지협의체 조례안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 : 주민참여와 감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조례를 만들도록 강제 : 구성, 공개 등의 원칙 삽입.- 167 -
4 지역을 넘어 :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웤-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전국적 네트웤을 추진중이며, 올해 공동의제로 예산감시운동과 지역복지협의체 감시운동을 채택한 바 있음.- 그러나 지역복지운동단체의 초보적인 연대활동으로 인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투쟁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역부족- <strong>빈곤과</strong> 차별철폐를 위한 전국적 공동전선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임.- 지역복지운동단체 중심의 운동전략과 제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운동전략 등이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분화, 강화될 것으로 예상.- 빈곤운동에 대한 사례 수집과 공동 전략 수립- 168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지방정치:토론2(별첨)토론자 : 최영선(위례지역복지센터 사무국장)- 169 -
- 빈곤은 국부의 규모나 경제 성장과는 무관- 빈곤 문제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책략에 불과- 빈곤은 국가의 사회정책 개입이 좌우- 상대적 다수의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출 → 절대 다수의 상대적 빈곤화- 현대 한국의 빈곤은 자유주의적 정치 지배에 기인- 경제사회적 빈곤은 정치적 빈곤, 자유주의의 과잉과 평등주의의 빈곤으로부터비롯- 자유확대 민주주의에서 평등보장 민주주의로 빈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가장 지배적인 관념은 빈곤이 ‘경제’ 또는 ‘경제 성장’에 연동돼 있다는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라가 잘 살아야 국민도 잘 산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 생활도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꾹 참고 나라 경제부터 일으키는 데 힘을쏟자. 그러다 보면 국민들에게도 곧 좋은날이 올 것이다.”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국회 국정연설은 이런 생각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정치 선동이었다.“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지는고통스러운 일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제 우리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 합니다. ……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거의- 170 -
2만 달러에 육박한다는 평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가 곧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단계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기업하기 좋은 환경 …… 경쟁력 강화대책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규제도 풀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 이것이 바로 선진한국입니다. ……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을 가지고 선진한국을 향해서 힘차게달려갑시다(2005. 2. 25).”과연 그러할까? 노 대통령 말처럼 몇 가지 경제정책을 펴고, 국민들이 ‘생각과 행동도 그에 맞추어나가’면 경제가 성장하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 대통령이 제안하는대로 해도 경제가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고, 우연히 경제가 다소 호전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된다는 개연성은 전무하다.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아래 표에 의하면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선 미국의 빈곤율이 스웨덴이나 독일의 두 배가 넘고, 1인당 GDP가 두세 배나 높은 한국이 빈곤율에서는 체코나 폴란드의 두세배를 기록하고 있다. 즉, 나라의 부가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고른 생활 또는 빈곤 문제와는별무 상관이다. 또, 경제 성장 여부 역시 빈곤 문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율이 비교 대상국들보다 높지만, 빈곤율 역시 높은 점을 알 수 있다.표 1] 각국 빈곤율 비교국가빈곤율경제성장율1인당 GDP(2003)(중위소득의 50%)2002 2003스웨덴 6.6(1995) 27,191 2.1 1.6독일 7.5(1994) 24,099 0.2 -0.1미국 17.0(2000) 36.012 2.2 3.1이탈리아 14.2(1995) 20,636 0.4 0.3한국 17.0(2000) 12,628 7.0 3.1체코 4.9(1996) 7,183 2.0 2.9폴란드 8.6(1999) 4,894 1.6* 외국의 빈곤율은 OECD(1995), 한국은 유경준․심상달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2004. 1인당 GDP와성장율은 통계청.한국의 경제 성장 추이와 빈곤율도 이렇다 할 연동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아래 표에 의하면1997년~1998년 기간에만 마이너스 성장이 빈곤율 상승으로 이어졌을 뿐이고, 성장율이 떨어진96~97년 기간에는 빈곤율이 소폭 하락, 성장율이 급등한 98~99년 기간에는 빈곤율 소폭 상승, 성장율이 소폭 하락한 99~00 기간에는 빈곤율 소폭 하락 현상이 보인다. 경제 성장이 빈곤율에 사후적으로 반영된다 할지라도 양자 사이에서 연동 관계를 찾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상충 관계를 찾아볼 수도 있겠다.- 171 -
표 2] 1996~2000년 GDP 성장율 및 도시가계 빈곤율 추이%14121086420-2-4-6-89.511 11.21099.58.5719964.71997 1998 1999 2000-6.9AB* 빈곤율 A(중위소득 50%)는 도시가계조사 원자료의 도시근로자 2인가구 이상(노대명, 『한국 자활사업의 현재와미래』, 2004에서 재인용), 성장률 B는 통계청.결론적으로 빈곤은 국부의 규모나 경제 성장과는 무관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경제와 경제성장을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방치하거나 빈곤을 조장하면서, 빈곤으로 인한 불만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책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한 사회의 빈곤을 좌우하는가? 빈곤은 그것에 대해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며,어떤 사회정책을 가지고 얼마나 개입하는가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 아래 표는 각 나라의 조세 정책 결과가 빈곤율과 일치함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도가 상당히 높은 스웨덴과 독일이 적극적재분배 정책을 통해 빈곤율을 낮추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기여가 극히미미함을 알 수 있다.표 3] 소득 불평등도의 국제비교국가지니계수 A(시장소득)지니계수 B(세후 가처분소득)변화율 =(B-A)/B×100빈곤율(중위소득의 50%)스웨덴(1987) 0.439 0.218 101.4 6.6독일(1984) 0.395 0.249 58.6 7.5미국(1986) 0.411 0.335 22.7 17.0이탈리아(1986) 0.361 0.306 18.0 14.2한국(2000) 0.374 0.358 4.5 17.0* 유경준․심상달- 172 -
특정한 사회 성원이 풍요한가 빈곤한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조건으로는 1 자산 2 고용 3소득 4 조세 5 복지(교육 의료 등을 포함하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십 수 년 간 한국 국가는이러한 분야에 있어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지난 십 수 년 동안 한국 국가는 새만금 간척․KTX 건설․경제자유구역 설치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을 펼쳤다. 이는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빠른 건설․토목 산업을 경제 운용 수단으로 애용하던1960~1980년대의 전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나름의 의욕을 보이던 노무현 정부는 다시금 “건설경기는 반드시 살려(취임 2주년 국정연설)”내는 방향으로 회귀하였고, 그 결과 전국 지가와 아파트 분양가가 앙등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주택가의 상승을 주택 소유자의 명목자산 증대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에 묶인 1가구 소유자에게는 주택 이외 영역에서의 빈곤을 낳고, 무주택자의 자가 보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여 주거안정을 통한 빈곤탈출이 저지된다.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김영삼 정부 이래 계속 악화되고 있다(1993년 0.48→ 2002년 0.51. 정의철,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2005).3대에 이른 ‘민주정부’의 고용 정책은 정리해고제 도입을 통한 고용 불안과 비정규 노동자 확대를통한 근로조건 악화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30여 년 간 꾸준히 올라 1996년 63%까지 이르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세 사람의 위정자,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의 노력에 힘입어 다시 58~59%대로 내려 앉고(한국은행), 상위근로소득과 하위근로소득 사이의 격차는 1992년을 기점으로 심화되어 2003년 4.35배까지 벌어지게 되었다(상하위 각 10% 기준.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은 파견직과 기간직을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함으로써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노동소득 박탈을 통해 자본이윤을 보장하려는원시축적 수준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은 가장 유력한 빈곤 탈출책이다. 하지만 근로빈곤가구가 점증(금재호, 「근로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2005)하는 현 시점에서 노동은 자본의 풍요를 보호하는 진입장벽이다.평균소득에 대비했을 때, 하위계층의 소득은 줄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느는, 즉 극심한 <strong>양극화</strong>의 경향이 ‘민주정부 3대’의 철칙이다. 하위 10%의 소득은 평균의 41%에서 34%로 -7%, 상위 10%의 소득은 평균의 199%에서 225%로 +26% 변화하였다(1995년 대비 2003년. 성명재, 「우리나라 소득세의 계층별 부담구조와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소고」, 2005). 자유주의 정부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시장에서의 <strong>양극화</strong> 경향을 제어하기는커녕 법인세․소득세를 인하하고, 골프채 모터보트에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strong>양극화</strong>에 일조하였다. “대기업, 상위 10%의 고소득층, 고가품에 대하여세 감면 혜택을 주느라고 재정여력이 바닥나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쓸 돈을 없게 만드는 게 현재 감세정책의 본질이다(심상정 2004. 8. 31).”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0원인장부는 무엇일까?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가 의결하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이다.현대 한국의 사회복지는 노태우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제도․예산․대상 등에 걸쳐 많은 발전을이루었다. 이는 1987년의 민주화투쟁과 1997년의 외환위기에 뒤이은 체제안정화 시도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확대는 급격히 증대된 국민의 욕구와 수요에는 여전히 미치지못하고 있다. 특히 그 범위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복지라 할 수 있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의 진척은대단히 더딘 편이다. 오히려 시장주의나 경쟁논리가 더욱 심화되어 세계 최악의 공공보장성을 면치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과 의료의 현실이다. 김대중 정부의 보건지소 폐지와 공공의료기관 민영화, 노무현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의 결과 하위 10%가 상위 10%의 두 배에 이르는 의료비 지출 역진- 173 -
성을 낳게 되었다(상위 10%의 가구소득 중 의료비는 3.8%, 하위 10%에서는 6.3%. OECD, 「OECDReviews of Health Care Systems : Korea」, 2003). 교육 차별은 더욱 심각하다. 역대 정부가 으레공언했던 교육재정 확충은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립형사립학교․평준화 폐지․시장개방 시도 등이지난 십 수 년 교육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상위 10%의 교육비 지출이 빈곤가구의 10배에 이르는 현실(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2)은 교육이 더 이상 계층상승의 통로가 아니라, 부와 빈곤의 세습 기제로 변질되었음을 웅변한다.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상대적 다수는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자유주의 정부들은 국민의 절대 다수를 상대적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 현대 한국의 빈곤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 경제의 잔여물이 아니다. GDP 10위인 ‘선진한국’의빈곤은 1987년에 유래하여 1997년 이후 본격화된 자유주의적 정치 지배에 기인한다.위 2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각 영역에서의 빈곤이 시작되는 시점은 대체로 1992년 또는 1997년과일치하고,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일련의 국가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국가정책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신자유주의’라기보다는 극우적인 경제정책을 혼합한 성장이데올로기에 가깝다. 경제자유구역 등의 시장개방 정책은 미국 민주당의 전략적 무역정책에 가깝고, 감세 정책과 노동유연화는 미국 공화당의 극우적 시장주의에 따른 것이며, 대형 국책사업은 박정희 시대 전가의 보도이다.구시대의 유력 정치인이었던 3김씨 뿐 아니라, ‘민주정부’들의 기획자․정책가로 수혈된 ‘386세대’들조차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국가정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이 변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1987년 변혁의 주체가 사회경제적 이익을 사상한 몰계급적 학생과 인텔리들에 의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물론그들도 ‘민중’이라는 언술로 대표되는 소박한 정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성장이데올로기를체화하는 데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회의식이 전후 고성장기 북한에서 동원이데올로기로서 형성되어, 남한의 사회경제적 현실로부터는 상당히 유리될 수밖에 없었던 ‘자주․민주․통일’이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남북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공히 가상의 집단 이익을 위해 권리 유보를 강제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박탈과 빈곤은 불가피한희생으로 치부되고 있다.그런데 1987년 헌법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에게는 사회복지와 일자리를 제공할의무를, 국민에게는 일자리와 사회복지를 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1987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경제사회권의 보장이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독주로 인해 유린되고 있는 것이다.1987월 6월 세력이 한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여 자유주의적 민주화를 이끄는 동안, 87년의 또다른 동맹세력 - 가을 총파업의 주역들은 정치적 기권과 조합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서민 실질소득 향상이 0%인 오늘날 기업의 이윤은 62%나 늘고(이상 한국은행), 고위공직자의 75%가 재산을불리는 것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경제사회적 빈곤은 정치적 빈곤, 즉 87년 동맹세력- 174 -
의 불균등 발전의 결과물인 자유주의의 과잉과 평등주의의 빈곤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1장에서 살펴본 각국의 빈곤율은 그 나라 진보정당의 지지율․득표율․의석수와 역비례한다. 만약 한국 사회가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 길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 뿐이다. 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민주화로부터 평등주의에 입각한 경제사회적 민주화로, 자유확대 민주주의에서 평등보장민주주의로의 이행이다.표 4] 각국 빈곤율과 진보정당 득표율 비교국가빈곤율(중위소득의 50%)스웨덴 6.6(1995) 41.25%주요 진보정당 득표율사회민주당 85, 88, 91, 94, 98,02독일 7.5(1994) 37.26% 사회민주당 87, 90, 94, 98, 02이탈리아 14.2(1995) 19.3% 좌익민주당 94, 96, 01미국 17.0(2000) - -한국 17.0(2000) - -* 정당 득표율은 www.parties-and-elections.de- 끝 -- 175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사회권:토론1(별첨)토론자 : 유의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176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사회권:토론2(별첨)토론자 : 박래군(인권단체연석회의)- 177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사회권:토론3(별첨)토론자 : 문헌준(노숙자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 대표)- 178 -
냉전체제가 끝난 오늘날 미국은 정치적으로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국가이다. 그러나 미국은 복지국가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결코 선진국이라 볼 수 없다. 미국의 복지제도는 거의 모든 계층으로부터 불만의 대상일 뿐이다. 그것은 독일,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의 사회보장제도와 비교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전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커녕 백인 중산층으로부터 그들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경멸과 증오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미국은 의료수가가 유럽이나 일본의 그것보다 엄청나게 비싸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전 국민이 혜택을받지도 못하는,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없는 유일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이다. 또한 가족수당조차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 국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미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복지'(welfare)라는 낱말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는커녕 강한 혐오감을 느낀다.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에서와는 달리 미국에있어서 복지는 국민이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게으름과 도덕적 허약함의 표상일 뿐이다. 미국에서 빈곤은 경제적 불황이 가져올 수도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부터 기인할 뿐이다.금세기 들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전 국민의 1/3 내지 1/5의 기층을 위해 두 번의 사회개혁을시도할 기회가 있었다.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연방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게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전통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했다. 한 번은 1930년대 대공황시절의 뉴딜정책으로, 또 한번은 1960년대 ‘위대한 사회’를 지향하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the War on Poverty)으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이었다. 1960년대는 케네디대통력의 ‘뉴 프론티어’(New Frontier)로부터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에 의해 미국사회의 개혁이 시도된 시기였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추방하고자 했던 존슨행정부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과 더불어 개혁운동의 백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초부터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보수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혁을 지지했던자유주의자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성과 평가에 관한 논쟁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49)- 179 -
본 논문은 과연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i)어떠한 정치철학과 이념에 기초해있었는지, ii)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쳐 계획, 입안, 집행 되었는지, iii)그리고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어떻게 평가해야할지를, 당시의 정책결정자 및 입안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과 20세기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을 제도적,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거시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케네디 및 존슨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행정부가 빈곤의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연방정부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아래 시작한 개혁 지향적 사회복지정책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된 기본적 이념과 철학의 틀은 구조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이미 한계 지워져 있었다. 빈곤의 원인을 이해하는 시각과 해결방식으로 제안된 빈곤 추방책 또한 그 경계가 확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정책선택의 범위가 이미 1930년대 루즈벨트(FranklinD. Roosevelt) 행정부가 설정한 이원적 복지체제(bifurcated welfare system)를 벗어나기 못했다.비교사적인 시각에서 미국과 유럽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가를 인식하게 되면, 미국이 얼마나 복지제도에 있어서 그 특이함을 유지해왔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케네디대통령은 1963년 봄 그의 보좌관으로 있던 역사가 슐레신저(Arthur Schlesinger, Jr.)에게, 영국에서는 실업률이 단 2%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의회로 행진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실업률이 6%까지 올라가도 아무도 게의치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50) 이러한 사실은 미국에서는 아무리 빈곤의 어려움이커지거나 실업이 심화되어도 빈민이나 실업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 요구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적 상황에서 빈곤이나 실업은 개인의 수치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을 본인 자신이 초래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인들이 빈곤의 원인을 구조적 혹은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케네디 및 존슨행정부에서 노동부차관보였던 모이니헌(Daniel Patrick Moynihan)은 빈곤의 문제에대해서 미국은 유럽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유럽은 경제구조에 있어서 바닥을 높이려고 애쓰는 반면, 미국은 천장을 높이려고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1) 이러한 지적은 유럽의 복지제도가 국가적 최소(national minimum)의 범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해왔다면, 미국의 그것은이러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2) Henry Aaron, Politics and Professors: The Great Society in Perspective (Washington, D. C.:Brookings Institution, 1978); Martin Anderson, Welfare: The Political Economy of Welfare Reform inthe United States (Stanford, Cal.: Hoover Institution, 1978); Sheldon Danziger and Daniel Weinberg,eds., Fighting Poverty: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Press, 1986); Robert Haveman, ed., A Decade of Federal Antipoverty Programs: Achievements,Failures, and Lessons (New York: Academic Press, 1997); Marshall Kaplan and Peggy Curti, eds.,The Great Society and Its Legacy (Durham, N. 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AllenMatusow, The Unraveling of America: A History of Liberalism in the 1960s (New York: Harper andRow, 1984); Charles Murray,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1950~1980 (New York: BasicBooks, 1984); John Schwarz, America's Hidden Success: A Reassessement of Twenty Years ofPublic Policy (New York: Norton, 1983). 특히 Murray의 책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쟁을불러일으켰다.50) Carl Brauer, "Kennedy, Johnson, and the War on Povert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69 (June1982), 11251) Report, "Education and the Underprivileged', folder "Chron File-Oct-Dec 1964," Box 13, AdamYarmolinsky Papers, John F. Kennedy Library[이하 JFK Library로 생략함].- 180 -
미국에서는 여전히 빈민의 노동의욕(work motivation)이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소득에서의 불평등이 당연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실업률이 유럽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strong>빈곤과</strong> 불평등의 관계를 높은 실업율과 연관지어 설명하지 않는다. 미국은 왜 빈곤의 문제를 실업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는가? 접근방향은 왜 항상 빈민들의 노동의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미국에서의 빈곤연구는 실업의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반면, 빈민의노동의욕이나 소득부조의 문제에 집착해있다. 게다가 <strong>빈곤과</strong>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무시되고 있다. 52)왜 그런가? 그것은 부분적으로 미국 나름대로의 독특한 복지체계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스웨덴의 사회정책학 교수인 코피(Walter Korpi)는 미국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티트머스(RichardTitmuss)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잔여적 복지모델’(redidual welfare model)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그런데 이 모델은, 유럽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체 국민이 복지 혜택을 입는 ‘제도적 분배모델’(institutional redistributive model)과는 대조적으로, “사적인 시장(private market)과 가족은 개인적 욕구가 충족되는 통로로서 여겨지며, 사회복지 제도들은 이러한 자연스런 메커니즘이 붕괴될 때사용되는 단지 임시적인 대체물(temporary substitutes)로서 여겨지는” 체제를 의미한다. 53) 그렇다면미국에서의 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몫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몫이며, 특별한 경우 그들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특정한 시기에 한해서 그들의 복지에 개입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미국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첫째, 미국의 복지제도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라는 이원적구조(bifurcated structure)로 되어있어 역사가 Michael Katz의 표현을 빌자면 ‘유사복지국가’(semiwelfare state)를 지향한다.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 만들어진 사회보장법(SocialSecurity Act)이 그러한 이원적 구조의 뿌리를 내렸다. 그 후 입법화 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체계가공고화되었다. 둘째, 미국의 복지체계의 역사적 전개는 젠더(gender)와 관련되어 있다. 유럽이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paternalist 복지국가를 지향했다면, 미국은 최초로 여성과 그 자식들을 대상으로한 maternalist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보장법의 경우, ‘공공부조’가 여성적 시각에서 고안된 개념이라면 ‘사회보장’은 남성적 시각에서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사회보장’의 주 수혜자는 남성이었으며, ‘공공부조’의 수혜자는 여성이었다.셋째, 지역통제로서 복지정책의 주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나 카운티 등의 지역정부라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만의 독특한 연방주의적 전통에 기인한다. 넷째, 공급위주의 정책이 구호 및 복지를 좌지우지했다. 즉, 미국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은 빈민들의 행동을 바꿔 빈곤을 줄이고자 하지, 왜 그들이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즉, 빈곤의 문제를 빈민들의 행동을교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 빈곤퇴치책의 핵심이다. 54)특히 우리의 관점 상 중요한 점은 첫 번째 특징으로 이원적 복지체계가 루즈벨트 행정부 하에서 그기초가 놓여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사회복지체계는 1930년대 사회보장법이 달성한 것과 달성치 못한 것과의 관련성을 통해, 그리고 뉴딜정책이 지향한 사회개력의 프로그램이 행한 것과 행하지 못한 것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55)52) Walter Korpi,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Critical Notes from aEuropean Perspective," in Vincent Covello, ed., Poverty and Public: An evaluation of Social ScienceResearch (Cambridge: Shenkman, 1980), 298~99, 301, 308.53) Ibid., 287, 309.54) Michael Katz, Improving Poor People: the Welfare State, the 'Underclass,' and Urban Schools as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23-3-27; Theda Skocpol, "State Formationand Social Policy," in her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1995), 12-13.- 181 -
루즈벨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대규모 공공사업(public works)에 연방 예산을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1933년 최악의 경제적 상황은 그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연방정부가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33년 5월 의회는 연방긴급구조를담당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던 것이다. 33년 5월 의회는 연방긴급구호국(Federal Emergency ReliefAdministration/FFRA)의 출현을 승인했다. 그 후 36년 6월 30일 폐지될 때까지 FERA는 30억 달러이상을 직접구호 및 노동구호(work relief) 지원에 사용했다. 또한 FERA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진토목사업국(Civil Works Adminstration/CWA)은 33년 11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 해 1월 약 4백만 명의 실업자를 공공사업에 투입했다. 민간자원보존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CCC)을 만들어청년들을 토양보존 및 삼림보존 등에 투입했다. 그 결과 34년 2울에 절정에 달했는데, FERA, CWA,CCC 및 일반구호를 통하여 미국 전체인구의 22.2%에 해당하는 약 8백만의 가구의 2천 8백만 명이일자리를 얻거나 직접 구호를 받았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공공사업으로서 루즈벨트 행정부는대공황이라는 비상사태 하에서 새로운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56)그러나 개인적으로 공공부조를 꺼려했던 루즈벨트는 이러한 조처들을 긴급 상황에 필요한 임시적조치로 생각했을 뿐이지 영구적인 정책으로 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1935년 1월 의회상하양원합동회의 연설을 통해서 루즈벨트는 150만 명의 노령 및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고용불가능한사람들’(the unemployables)로 구성된 부조수혜자와 전국적인 공황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는 350만명의 고용 가능한 부조수혜자를 구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는 빈궁상태로부터 실업자들의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자립심, 용기, 결심도 보존해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연설에서 구호가 마약처럼 인간정심을 좀먹는다고 강렬하게 비판했다. 57)루즈벨트의 이러한 구별은 1935년의 사회보장법으로 구현되었다. 그는 ‘사회보장’과 ‘공공부조’와의구별을 강조하여 오늘날 미국의 유사복지체계의 주춧돌을 놓았다. 당시 ‘사회보장’은 일종의 사회보험으로서 실업보험과 고령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공부조’는 65세 이상의 노인, 맹인, 피부양아동(dependent children) 등의 ‘자격 있는 빈민들’(deserving poor)에게 제공되었다. 그 결과 루즈벨트행정부는 여러 종류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전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복지프로그램의 출현을완전히 가로막았다. 58)루즈벨트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보장법 하에서는 일정한 권리를 지닌 시민들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법의 기본개념은 ‘자격’(entitlement)이었다 . 고용가능한 자들은 자격을 갖추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사회보험에가입할 자격이 없는 ‘고용불가능한 사람들’은 공공부조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즉, “포함되는 모든 시민은 그의 이익이 권리로서 예정되어 있는 사회의 가치 있는 일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민은 반드시 한 번 혹은 그 이상 산업사회의 일원으로 활약했어야 했다. 따라서 1939년까지 실업보험에그의 가족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게다가 대다수의 소수인종이 차지하고 있었던농업노동자나 가내노동자는 포함되지도 않은 불과 전체 노동자의 50% 이하를 포함할 뿐이었다. 59)55) Skocpol, "The Limits of New Deal System." in her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21156) William Leuchtenburg, Franklin D. Roosevelt and the New Deal, 1932~1940 (New York: HarperTorchbooks, 1963), 52; Katz, Improving Poor People, 51~53; Robert Bremner, "The New Deal andSocial Welfare," in Harvard Sitkoff, ed., Fifty Years Later (New York: Alfred Knopf, 1985), 8357) Bremner, "The New Deal and Social Welfare," 73, 75.58) Katz, Improving Poor People, 56; James Patterson, America's Struggle Against Poverty 1900~1985(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67.59) Littie Tartell. "An Examination of the Major Influences on the Content and Timing of the SocialSecurity Legislation, 1935," in Herbert Rosenbaum and Elizabeth Bartelme, eds., Franklin D.- 182 -
원래 사회보장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분담금을 지불하는 사회보험으로부터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호받고 공공부조의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즉, 그들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분명히구별하는 이원적 사회복지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법을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공부조를 받기 어렵게, 수혜자에게는 받는다 치더라고 수치감을 느끼게끔 만들었다. 특히 남부의 많은주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 60) 대다수의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정책이 빈민과 빈민이 아닌 사람들을차별하지 않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구별하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의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차별 하에서 사회보험의 경우 분담금을 본인이 지불한다는 점과 공공부조에대한 거부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미국에서 ‘welfare'에 대한 한계를 좁혀놓았다. 61) 오늘날 미국에서 ’welfare'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welfare'라는 용어가 편협되게 사용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19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의 사회복지정책에 기인한다. 게다가 공공부조는 빈민구호(poor relief)로부터 발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welfare'를 경멸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뉴딜시대에 확립된 미국의 이원화된 복지체계는 케네디 및 존슨행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생각할 수있는 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이미 그어놓았다. 즉, 그들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라는 엄청나면서도 획기적인 빈곤추방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라는 이중적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Katz의 표현을 빌자면, 미국적 복지체계라는 덫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62)따라서 우리는 케네디 및 존슨행정부에서의 정책브레인들이 어떻게 빈곤을 인식하고, 어떻게 빈곤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는가를 이러한 인식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만 한다.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빈곤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절대적 빈곤은 산업사회 이전의 농업사회에나 의미가 있는 정의이다.그야말로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생필품의 부재상태를 절대적 빈곤이라 볼 수 있지만, 고도의 산업사회를 구가하던 1960년대 미국사회에서는 절대적 의미에서 기아나 영양실조 등으로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미국의 소득구조의 특징은 그 구조가 적어도 20세기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1904년의 Robert Hunter, 1925년의 Paul Douglas, 1964년의 경제자문회의(Council of Economic Adviser/CEA)는 각각 20세기 초건 1920년대건 혹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선포하던 1960년대건 항상 최하층 20%가 빈곤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조건은 개선되었지만 빈곤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산업사회에서 빈곤은 상대적 개념일 수밖에 없으며, Matusow가 주장하듯이, 빈곤은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을 의미할 수 있다. 63) 그런데 만약 빈곤이 상대적 박탈의 문제라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층 간의 소득불균형 때문일 것이며, 따라서 빈곤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Matusow도 지적하듯이, “미국적 기준으로 이것은 급진주의이며, 진지하게 생각되고 싶어하는 어떠한위원회나 정치가도 이것을 옹호할 수 없다.” 64)Roosevelt: The Man, the Myth, the Era, 1882~1945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1987), 324.60) Skocpol, "The Limits of New Deal System," in her Social Policy in the Unites States, 212~13.61) Patterson, America's Struggle Against Poverty, 76.62) Katz, In the Shadow of the Poorhouse: A Social History of Welfare in America, 10th anniversaryedn. (New York: Basic Books, 1996), 259.63) Robert Hunt, Poverty (1904); Paul Douglas, Wages and the Family (1925); the Annual Report of theCouncil of Economic Advisors (1964); in Alan Matusow, "Lyndon B. Johnson's War on Poverty: theLimits of Liberal Reform," Paper presented Nov. 14, 1985, to the Southern Historical Associationannual meeting, Houston, Texas, pp. 3~4.- 183 -
존슨행정부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빈곤을 정의하는 데서부터 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 빈곤을 어떻게정의하는 가는 그야말로 빈곤의 상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었다. 보건교육복지(Health,Education, and welfare/HEW)부의 차관보였던 Wilbur Cohen도 절대적 빈곤의 개념적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 60년대 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상태에 있었는가는 어떻게 빈곤을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히 절대적 빈곤의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가에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그는가족당 연간소득 3천 달러를 빈곤선으로 정하는 것은 근사치일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65) 따라서 존슨행정부에서 선택한 빈곤의 정의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었다.당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천 달러 이하의 상태를 빈곤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는고정된 조건으로서 절대적 빈곤을 의미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적 빈곤상태를 가름하는 선을 3천 달러로 정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빈곤을 고정된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단지 3천 달러이하의 사람들만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때문에 존슨은 상류계급이나 중간계급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빈곤을 퇴치할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할 수 있었다. 세금감면을 통해서 중산층이나 기업에게 혜택을 주며, 동시에 빈곤의 문제를국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것이다. 중요한 점은 가진 자들의 이익과 상치되지 않으면서 무력했던 빈민층을 도와야한다는 점이었다. 66)어찌 보면 존슨행정부는 쉬운 방법으로 빈곤을 퇴치하고자 했다. 즉,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는것이 아니라 파이의 크기를 키워 절대적인 양을 기층의 빈민들에게 더 많이 제공하여 빈곤선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더 많은 빈민들에게 제공하여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보았던 것이다. 존슨의 경제참모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가정을 하고 있었다. 첫째, 경제적 성장이 계속되는 한, 자동적으로빈곤의 크기는 줄어들 것이다. 둘째,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빈곤대책은 빈곤층의 축소를 더욱가속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유산계급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67) 그러므로 존슨행정부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어려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을 통해서 그 혜택을 빈민들에게까지확대하겠다는 것이다.부의 재분배라는 해결방식을 금기시했던 것은 존슨 행정부만의 것이 아니라 케네디 행정부에도 해당되며, 더 나아가 20세기 사회개력을 지향했던 미국의 개혁적 정치가, 관료, 지식인들이 피하고자 했던 공통적인 시각이었다. 여기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의 구조적 한계가 놓여있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20세기들어 최초로 본격적인 <strong>빈곤과</strong>의 대결을 의미했지만, 그 싸움의 성격은 이미 주어져있었다.주어진 사회에서 어떤 특정계층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다른 계층의 손해를 가져오는 제로섬 게임같은 것은 아닌가? 어떻게 특정한 계층이나 이익집단의 희생이나 손해 없이도 사회개혁을 수행 할 수있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개혁을 지향하던 1960년대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두 목표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에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미국의 빈곤에 대해서 “전멸시키겠다.(eliminate), "뿌리뽑겠다“(eradicate), "정복하겠다”(conquer) 등의 과격하고도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비록 그러한 용어들의 수사학적 의미를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60년대 민주당행정부의 자신감과 낙관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 행정부는 전상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64) Matusow, "Lyndon B. Johnson's War on Poverty," 5.65) Cohen's address, "The Elimination of Poverty: A Primary Goal of Public Policy." /23/64, pp. 3~5,Box 4, Wilbur Cohen Papers, Lyndon B. Johnson Library[이하 LBJ Library로 생략함].66) Matusow, "Lyndon B. Johnson's War on Poverty," 2.67) Matusow, Unraveling of America, 218-220; James Tobin, "Poverty in Relation to MacroeconomicTrends, Cycles and Policies," in Sheldon Danziger, et al., eds.,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Chan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148.- 184 -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케네디가 남겨놓은 유산을 존슨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케네디의 급작스런 비극적 죽음으로 예기치 않게 대통력 직에 오른 존슨은 빈곤문제를 자신의 주제로만들고자 했다. 존슨이 ‘위대한 사회’를 목표로 64년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선언한 이루 68년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사회복지에 관한 수많은 법령들이 행정부에서 만들어지고, 의회를 통과했다. 존슨은 빈곤을 국가적인 문제로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비록 케네디가 토대를 놓았다 하더라도 빈곤이라는 과제는 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다. 대통령후보로 나선 1960년 8월 14일, 케네디는 사회보장법 통과 25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war against poverty)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연설을 통해 비록1930년대에 물질적 고통과의 싸움에서는 성공했지만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나아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도 “자유사회가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8) 사실상 케네디가 개인적으로 빈곤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인것은 1960년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의 예비선거 때였다. 그러나 그 후 대통령으로서 첫 2년 동안 그가 취한 빈곤대책은 애팔래치아지역특별위원회(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를 만든 것뿐이었다. 1963년 이전까지 빈곤은 케네디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었다. 69)1962년 비판적 좌파 지식인이었던 Michael Harrington의 『또 다른 미국: 미국에서의 빈곤(TheOther America: Poverty in the United States)』이 출간되었을 때, 처음에 이 책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3년 1월 문예비평가인 Dwight Macdonald가 New Yorker에 기고한 서평인‘Our Invisible Poor'을 통해서 그의 책이 지식인 및 중산층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결국 그의 책은미국인들이 잊고 있었던 빈곤의 문제를 인식케 만든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야말로 갑자기 ’풍요로운사회‘ 속에서 빈곤이 재발견된 것이다. 70) 이 책은 케네디를 비롯한 최고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63년 봄부터 케네디는 그의 정책브레인들에게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 대책을 만들것을 요청했다. 케네디는 특히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던 Walter Heller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Heller의 참모였으며 CEA 내에서 빈곤에 관한 전문가였던 Robert Lampman이 작성한 통계자료에따르자면, 1961년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상태는 사실상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비록 빈곤선-당시 기준으로 3천 달러- 아래 위치하는 가구 숫자의 비율이,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1947년과 56년사이에 33%에서 23%로 10%나 줄어든 반면, 1956년부터 61년까지 미국 전체 가구 수에서 빈곤선아래 위치하는 가정의 비율이 23%에서 21%로 겨우 2% 줄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래의 표를 통한통계만 보자면 빈곤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다.물론 이 메모를 케네디에게 보고한 Heller의 초점은 저소득가정이 빈곤에서 빠져나오는 속도가 늦68) OEO[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Report, vol. 1, part1, pp. 7~8, Box 1, AdministrativeHistories/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 LBJ Library69) Nicholas Lemann, The Promised Land: the Great Black Migration and How It Changed America(New York: Alfred A. Knopf, 1991), 130~31.70) Ibid., 131.- 185 -
어지고 있는 이유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빈곤의 크기를 그전 같은 속도로 줄이기위해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1947 1950 1953 1956 1957 1961비율(퍼센트) 33 32 26 23 23 21가구수(백만) 12.3 12.8 10.7 10.0 10.1 9.73천 달러 이하의 소득을 지닌 가구의 비율과 숫자[출처: Memo, Heller to the President, 5/1/63, folder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5/1/63-9/23/63,"Box 31, Theodore Sorensen Papers, JFK Library]1963년 6월 Heller는 Lampman에게 1964년 선거를 대비하여 “가능한 케네디(행정부)의 빈곤에 대한 공격책”(A possible Kennedy offensive against poverty)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빈곤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strong>빈곤과</strong> 맞싸워야하는지 궁금해했다. Lampman은 기존의 정책들-교육보조, 학교점심 프로그램, 낙후지역 프로그램, 저소득 농장지역재개발 등-을 나열하면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빈곤의 출구를 열어주고 빈곤상태로 다시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Heller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다음과같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의 소득분배 밑부분이 항상 그러하듯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에서 어떠한 정치적 다이너마이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의 최하층 1/5는전체소득의 5%를 넘지 못한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은‘불평등(inequality)' 이나 ’소득 혹은 부의 재분배(redistribution of incomeor wealth)'라는 용어 사용을 완전히 배제해야할 것이다. 71)그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 미국에서 빈곤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과는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오히려, 절대적 의미에서 빈곤을 없애는 것은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을 확대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기회의 평등’을 확대한다는 것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72)Lampman은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통한 빈곤층 감소 같은 획기적인 생각이 미국적 풍토에서, 특히 의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케네디 그리고 나아가 존슨의민주당 행정부하에서도 빈곤문제는 소득의 불평등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했으며, 그러한 인식틀 내에서 빈곤추방책을 만들어갔다.Heller는 그의 또 다른 참모인 경제학자 William Capron에게 새로운 빈곤 프로그램을 기안할 것을요구했으며, Capron은 연방정부의 부서간의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71) Memo, Heller to Lampman, 6/3/63; memo, Lampman to Heller, 6/10/63, folder "CEA Draft Historyof the War on Poverty (1 of 3)," Box 1, Legislative Background/EOA[Economic Opportunity Act] of1964, LBJ Library.72) Memo, Lampman to Speechwriters on Poverty, April 1964, pp. 5~6, Box 4A37, Robert LampmanPapers, LBJ Library- 186 -
다. 각 부서는 자신들이 입장에서 빈곤정책을 제안하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보건교육복지부(HEW)는 교육과 복지를 통해서, 노동부는 직업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부는 농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게다가 각 부서간의 아이디어는 구태의연했다. 1963년 10월 Capron이 대통령 특별고문인 Theodore Sorensen에게 무려 150개의 빈곤프로그램이 나열된 보고서를 제출하자 Sorensen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73) Capron 또한그가 여러 부서로부터 제안 받은 빈곤대책들이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74)Heller와 그의 동료들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었던 63년 가을, 그들은David Hackett와 Richard Boone을 만나 청소년 비행 대통령특별위원회(President's Committee onJuvenile Delinquency)에서 개발한 ‘지역사회 행동’(Community Action)에 관해서 듣게 되었다.Heller는 듣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것이 그가 원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빈곤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조정신에 입각한 ‘지역사회 행동’을 중심으로한 빈곤대책을 만들고자했다. 또한 기존의 관료주의 장벽을 벗어나면서도 특정의 부서에 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을 전담할 기구를 창안하고자 했다. 75)63년 11월 19일, Heller는 케네디를 면담했다. Sorensen의 정보에 의하면, 케네디가 64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하여 중산층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암시했기 때문에 그는 케네디와 직접 만나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만남에서 케네디는 그에게 훌륭한 대책을 갖게 된다면 빈곤문제를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교외에 거주하는 중간소득계층을 위해서도 뭔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76) 그것이 Heller와 케네디와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케네디는 그가 암살당하기 전 빈곤이라는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가 존슨처럼 복지정책을연방정부가 해결해야할 우선순위로 놓았을 까는 의심스럽다. Heller는 케네디 암살직후 존슨을 만나 케네디가 죽기 전에 빈곤문제와 씨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알려주었다. Heller가 놀랍게도, 존슨 또한 빈곤문제에 깊은 동조와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빈곤 추방책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존슨은 Heller를 만나 자리에서 자신을 루즈벨트의 이념적 노선을 추종하던 자유주의자로 정의하면서, 오히려 케네디는 자신의 시각에서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77) 존슨의 우상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이다. 그는 뉴딜정책에서 감동을 받았으며 따라서연방정부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존슨의 빈곤추방책에 대한 기본적 시각은 ‘기회’(opportunity)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타났다. 존슨은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시혜나 ‘공공부조’식의 프로그램은 딱 질색이었다. 예를 들어, 존슨은 ‘<strong>빈곤과</strong>의전쟁’의 야전사령관 격인 Sargent Shriver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베푸는 시혜는 결코 안된다고강조했다. 78) 존슨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무조건적인 시혜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훨73) Lemann, Promosed Land, 132~33.74) Matusow, Unraveling of America, 120.75) Lemann, Promised Land, 133.76) Heller's Oral History Interview, 2/20/70, Interview I, pp. 19~20, LBJ Library; Memo, Heller toSorensen, 11/20/63, folder "Council of Economic Adviser 11/10/63~2/5/64+undated," Box 31, Sorensen Papers, JFK Library77) Heller's notes, "Notes on Meeting with President Johnson, 7:40 p. m., Saturday, November 23,1963," folder "11/16/63~11/30/63," Box 13, Walter Heller Papers, JFK Library- 187 -
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64년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돈이 부족하거나 직업이 없는 상태를 빈곤의 원인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빈곤의 징후로 판단했다. 그는 사회가그들에게 더욱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하며,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건 간에 국가는 빈곤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몰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79)따라서 존슨과 그의 정책브레인들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존슨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구호나 복지비용을 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1/5의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를 주고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참모들도 그들이 가난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동등한 기회’가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존슨 행정부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통하여, 성인들에게는 직업훈련의 기회를 통하여 빈민들이 빈곤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기대했다. 80)존슨 행정부의 빈곤정책의 또 다른 상징적 슬로건은 “구걸이 아닌 자립”(a hand up, not ahandout)으로서 결코 빈민들에게 공짜로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자들에게만 국가가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어떤 면에서 이 슬로건은 빈민들이 여전히 가난한 것은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간계급의 문화로 동화시키겠다는 전제에입각해있었다. 81) 그렇다면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무엇보다도 개인주의적인 자조의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새로운 빈곤법안은 경제자문회의와 예산처의 정책입안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 초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단순한 공공사업, 주택사업, 농업보조사업, 혹은 취업프로그램이 아니다. 또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수행할 중심 기관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CommunityAction Program)의 담당 부서-훗날 경제기회국(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으로 명명됨-가 될것이다. 또한 예산은 직접적으로 가난에 고통받는 가정에 사용될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은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동 법안은 몇몇 도시와 농촌 지역을 선정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각 지역이 주도권을 갖고 연방 및 주 정부가 도와주는 형태를 갖자고 했다. 82) 그러므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64년 1월 하순경 행정부 내에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소수세력으로서 노동부장관인 Wirtz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가난하다는 것은 소득이 없다는 것을 뜻하며, 소득이 없다는 것은 실직상태에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게다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에는 최소임금이나 인력훈련 등의 노동부 프로그램이 포함되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직접적으로 거의 일자리를 만들 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빈민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효과는 간접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의 그러한 비판에 Heller나 예산처장인 Kermit Gordon은 제대로 논박하기 어려웠다. 83)78) Lemann, Promised Land, 14979) Annual Message to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1/8/64, in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of the United States: Lyndon B. Johnson, 1963~64, 2 vols. (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Office, 1965), 1: 114.80) James Gaither's Oral History Interview, 5/12/80, Interview Ⅳ, p. 1, LBJ Library; Patterson,America's Struggle Against Poverty, 135.81) Lemann, Promised Land, 151.82) Memo, "The Attack on Poverty Bill," 1/23/64, folder "Poverty Program Meeting Sorensen's Office1/23/6, Box 41, Heller Papers, JFK Library- 188 -
그러나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직업훈련(job-training) 프로그램이나 일자리 만들기(job-creating)프로그램은 예산상의 문제만으로도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존슨은 대규모 세면감면안을 승인해놓고 있었다. Wirtz는 담배에 5센트의 세금을 부과하여 12억 5천만 달러의 재원을 만들어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존슨 대통령은 64년 2월 16일자 각료회의에서 그의 제안을 가볍게 일축해버렸다. Yarmolinsky의 회고에 의하면, 존슨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존슨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그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던것이다. 84)존슨은 고용정책을 지향하던 노동부안을 무시했는데, 왜냐하면 그도 케네디처럼 경제성장에 의해구조적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존슨은, 당시 의회 내의 민주당원들이나주나 지역의 당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입안할 때 완전고용 보장정책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다. 85) 결국 Wirtz는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는 놓고서 싸운 Heller와의 이념투쟁에서 진 것이다. 분명히 존슨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의 기회를 빈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빈곤 정책의 목표로 삼았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빈곤상태로부터 빈민을 구해내고자 하였다. 자조정신에 입각하여 스스로 빈곤의악순환으로부터 빠져나오고자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즉,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역사가 Edward Berkowitz는 Job Cops(직업교육단)이나 직업훈련에서 존슨 행정부 빈곤정책의 백미를 찾고 있다. 86)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에서 기존의 빈곤대책과의 차별성을 찾으려면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에서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행동’은분명히 존슨 행정부 빈곤추방책의 핵심이었다. Wilbur Cohen은 ‘번영 속의 빈곤’이라는 주제를 내건조지타운대학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하여, 존슨 행정부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할 것이며, 중심적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행동’을 통하여 수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동시에 존슨 행정부의 빈곤 정책은 “연방부서간의 조정과 협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관들, 그리고 특히 지역의 민간영역의 완전한 참여를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87) 따라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의 정책적 특징은 ‘지역사회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수 있다.‘지역사회 행동’ 은 기존의 것처럼 빈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빈민의 빈민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접근을 허용한 실험적인 빈곤프로그램이었다. 즉, 기존의 빈곤대책과는 달리 가난한 사람들이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빈곤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주정부나 지역정부는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실험으로서 미국적 전통으로부터 일탈로서 파행성을 드러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흑인파워와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이 동일시되었다. 주나 지역의 행정관료와 정치가들은 ‘지역사83) Bernstein, Guns or Butter, 9884) Lemann, Promised Land, 154; Yarmolinsky's Oral History Interview, 10/21/80, Interview Ⅳ, pp. 4~5,LBJ Library.85) Skocpol, "Brother, Can You Spare a Job?: Work and Welfare in the United States,"in her SocialPolicy in the Unites States, 245, 24786) Berkowitz's movie review,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2 (Dec. 95), 1327~2887) Cohen's address, "The Elimination of Poverty: A Primary Goal of Public Policy," 1/23/63, p. 23,Box 4, Cohen Papers, LBJ Library.- 189 -
회 행동’을 통해 급진적 청년들이 정치권력의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많은 사람들,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행동’은 ‘지역사회 분열’(community disruption)로 여겨졌다. 88)‘<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 집행자들은 오래지 않아 빈곤문제와 인종문제가 서로 얽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경제적 통합과 인종적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빈곤퇴치가 힘들다는 것을 깨닫데 된것이다. 89)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존슨도 점차 ‘지역사회 행동’ 지도자들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경제기회국과 그 책임자인 Shriver에 대한 불신도 커져만 갔다. 마침내 존슨은 국내담당특별보좌관인 Joseph Califano에게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경제기회국의 존폐가능성에대한 연구를 지시했으며, 그는 존슨에게 경제기회국의 해체는 너무나 큰 정부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경제기회국 내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존의 연방부서로 옮겨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건의하여 실천에 옮겼다. 90)결과적으로 본다면 경제기회국이 만든 다른 프로그램들 - Head Start Upward Bound, JobCorps, VISTA(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등 - 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에게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과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 이 동일시됨으로써,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커다란타격을 받게 되었다. 빈곤의 문제가 인종의 문제로 변질된 것이다. 1960년대 민주당정부의 빈곤정책의 새로운 접근을 상징했던 지역사회 행동 프로그램이 흑인들의 정치운동과 동일시됨으로써 많은 백인 중산층의 비난과 비판을 받고 결국 해체될 운명을 맞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행동프로그램’은 “새롭고도 폭발성 있는(explosive) 전략‘이었다. 91) 그러나 그만큼 기존 정치세력의 저항도 드세었던 것이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에 있어서 목표를달성하기에는 충분치 못했다. 아니, 턱없이 모자랐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수행했던 정책담당자, 낙관론에 물들었던 자유주의 개혁가들은 몇몇 전투에서는 승리했는지 몰라도 전쟁에서는 졌거나 혹은 최소한 이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전쟁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그 이념적, 재정적 수단이 너무 제한되어 있었다.이론상 1964년 초 존슨이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선포할 때 당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해결책은 크게세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소득재분배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미국의 경제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따라서 미국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정책입안자들은 이 방식을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제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스웨덴의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인 뮈르달(Gunnar Myrdal)이 64년 1월 조지타운대학에서열린 ‘<strong>빈곤과</strong> 번영’에 관한 회의에서 소득분배를 통한 빈곤의 제거를 건의했지만, 이러한 생각은 미국88) James Gaither's Oral History Interview, 3/24/70, Tape 5, p. 30, LBJ Library. Gaither는 1966년에서69년 사이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담당한 정책보좌관이었다.89) OEO's report, vol. 1, part 2, pp. 618~19, Administrative Histories/Office of Economic Opportunity,LBJ Library.90) Califano, The Triumph and Tragedy of Lyndon Johnson: the White House Years (New York: Simon& Schuster, 1991), 77~80.91) Katz, In the Shadow of the Poorhouse, 267- 190 -
에 있어서 급진좌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92) 오히려 케네디 및 존슨행정부는 세금감면을 통한 경제적 성장과 그로 인하여 절대적 빈곤이 줄어들기를 기대했을 뿐이다.둘째, 소득보조(income maintenance) 혹은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이다. 첫째 방식만큼 급진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미국적 기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었다. 1964년의 경제자문회의의 보고서는 소득이전이라는 아이디어가 매력적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왜냐하면 기존의 조세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덜 받은 사람들에게 소득 보충이 되기 때문이며,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노력으로 소득을 얻기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Heller나 경제자문회의에 있던 경제학자들은 소득재분배나 소득이전 모두를 반대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이 실현될 경우 부딪치게 될 엄청난 정치적 반대와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 93) 경제자문회의의 일원이었던 예일 대학의 James Tobin 교수도 당시 존슨 행정부가 소득재분배나 소득이전 모두를 꺼려했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94)셋째, ‘동등한 기회’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는 보통의 미국사람들과 달리 기회가 봉쇄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통해 빈곤의 구렁텅이로부터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고 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존슨 행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입안자들의 동의했던 해결책이다. 이 방식만이 미국적 가치와 전통에 입각해있었기 때문에 의회나 기타 압력단체들의협조와 후원을 손쉽게 끌어 낼 수 있다고 예상되었다. 따라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의 전략은 자조의 정신에 입각한 빈민들에게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welfare에 의존하는 상태를 심화시키고 노동의욕을 저하시켰으며, 나아가 ‘underclass’를 양산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95) 여기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남긴 역사적 아이러니가 존재한다.‘<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성공할 수 없었던 재정적 요인으로는 필요한 예산확보의 실패와 베트남 전쟁을들 수 있다.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지휘하던 본부인 경제기회국은 출범한지 반년도 안 되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1965년 5월 이후 예산처는 일련의 편지를 통해 존슨의 뜻을 하달하면서 예산삭감을 요구했다. 따라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시작서부터 상당한 장애물을 갖게 된 것이다. 96) 게다가예산처는 Shriver의 경제기회국 운영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65년 가을 쌍방간에 오고간 메모들은Shriver를 겨냥하고 있었다. 작성자인 John Forrer의 이름을 딴 Forrer Memoranda는 경제기회국을살리기 위해서는 Shriver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97)1965년 12월, Shriver는 Kermit Gordon 후임으로 예산처장이 된 Charles Schultze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나친 예산상의 절감요구 때문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는 필요한 비용인 35억 달러를 21억 달러로 줄여 보고했는데도 예산처에서 15억 달러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겨우 가난한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흥분하고 있는 와중에서 과연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는 분명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98)92) Myrdal's Draft No. 3, "Poverty In Plenty: the Matrix," pp. 12~13, fold "Georgetown Conference onPoverty and Affluence 1/23/64," Box 41, Heller Papers, JFK Library.93) Brauer, "Kennedy, Johnson, and the War on Poverty," 119, 107~08, 118.94) Mark Gelfand, "The War on Poverty," in Robert Divine, ed., Exploring the Johnson Years (Austin,Texas: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152, n. 54.95) 대표적으로 Murray의 Losing Ground를 볼 것.96) OEO's report, vol. 1, part 2, pp. 608~09, Box 1, Administrative Histories/Office of EconomicOpportunity, LBJ Library.97) William Kelly's Oral History Interview, in Michael Gillette, Launching the War on Poverty: An OralHistory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6), 349.- 191 -
1966년 11월 Shriver는 또 한번 예산상의 문제로 좌절감을 맞보아야 했다. 의회가 67회계년도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겨우 현상유지가 가능한 17억 5천만 달러를 요구했는데도 의회가 경제기회국의 예산을 줄인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그만한 액수갖고도 과연 효과적으로 빈곤의 상태를 줄일 수 있을지 염려스러운 판에 오히려 그나마 적은 예산을 의회가 잘라버렸기 때문이었다. 99)‘<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지휘하던 경제기회국은 처음서부터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의 1/10도 확보하기못했다. 첫 해에 확보한 예산인 9억 6천 2백 5십만 달러는 빈곤을 제거하는데 드는 한 해 추정 비용의 9%도 되지 못했다. 100) 게다가 빈곤퇴치 예산은 매년 증액되었지만 존슨이 공약했던 것과는 큰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약속제시와 현실간의 간격은 시간을 두고 계속 나타났으며, Schultze도 인정하듯이, 그러한 간격은 사람들의 “좌절과 신뢰감 상실”에 이르렀다. 101)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거창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빈민들의 기대는 당연히 높아져갔으며,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실제적인 예산집행은 빈곤 추방을 하기에는 너무 모자랐다. 따라서 현실과 기대치간의 매울 수 없는 간격은 실망과 좌절로 연결되었다.이렇듯 초창기부터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치 못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존슨행정부의 베트남전쟁 개입 때문이었다. 102) 가속되는 미국의 베트남 참전은 국가예산을 스폰지처럼엄청나게 빨아들였다.1964년 여름 미의회는 두 개의 주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나는 ‘경제기회법’(EconomicOpportunity Act)으로 명명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 프로그램이며, 나머지는 통킹만 결의안(Gulf of TonkinResolution)이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국내와 국외에 동시에 대규모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존슨행정부가 그렇게 깊숙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하리라고는, 그리고 그 전쟁이 결국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에 치명적 상처를 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었다.존슨은 미국이 국내에서의 ‘위대한 사회’로 표방되는 사회개혁과 국외에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즉, 그는 ‘총과 버터’(guns and butter) 정책을 추구해나가겠다는의지를 분명히 했다. Heller는, 경제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존슨의 ‘총과 버터’ 정책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존슨을 옹호했다. 한 해에 8천 5백억 달러의 국부를 생산하는 가운데 3백억 달러 미만을 베트남전쟁에 투입한다고 미국경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즉, 군사비가 전체 국내총생산의10% 미만일 경우에는 -평화시였던 55~60년보다 오히려 비율은 더 적다면서- 개혁과 전쟁을 병행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103)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총과 버터’정책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국내의 개혁정책을 수행하면서 태평양 건너의 전면전을 동시에 수행하기는 불가능했다. 아무리 미국경제가 성장을 계속해도 국내의 빈곤퇴치책에 돈을 지출하면서, 동시에 베트남에도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추구될 정책이 아니었다. 차라리 “총 혹은 버터”를 선택해야만 했다.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었다. 결국 존슨은 베트남전쟁에 매달리게 되었으며, <strong>빈곤과</strong>의전쟁은 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총을 버터에 우선함으로서, 개혁보다98) OEO's report, vol. 1, part 2, pp. 610~12, Box 1, Administrative Histories/Office of EconomicOpportunity, LBJ Library.99) Ibid., 613~14.100) Katz, In the Shadow of the Poorhouse, 266~67; Bernstein, Guns or Butter, 102.101) Gelfand, "The War on Poverty," 145.102) Godfrey Hodgson, America in Our Time (New York: Doubleday &Company, 1976), 271; Katz, Inthe Shadow of the Poor House, 266.103) Heller's "President Johnson and the Economy," in James MacGregor Burns, ed., To Heal And toBuild: The Program of President Lyndon B. Johnson (New York: McGraw-Hill, 1968), 164.- 192 -
전쟁을 선택함으로써 미국과 존슨은 엄청난 재난에 빠지게 되었다. 남북전쟁에 이르렀던 1850년대 이후로 1960년대 후반만큼 미국사회를 분열시켰던 시기는 없었다. 104) 안으로는 인종간의 반목과 밖으로는 베트남전쟁의 미국화로 인하여 미국은 인종간, 지역간, 계급간의 증폭되는 갈등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게 되었다.과연 총과 버터는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양자택일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결국60년대 미국사회를 분열에 이르게 만들었다. 게다가 존슨행정부의 ‘총과 버터’ 정책은 존슨 개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커다란 비극이 되었다. 105) 존슨의 정책보좌관이었던 Harry McPherson은 베트남전쟁이 ‘존슨의 전쟁’으로 바뀌면서, 아무도 존슨의 참전의지를 바꾸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Yarmolinsky도 자신이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다시 한 번 수행한다면, 우선적으로 베트남전쟁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고 지적할 만큼 베트남전쟁은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에 치명적 부담이 되었다. 106)이러한 모든 상황이 마침내 자유주의자조차도 존슨행정부를 비난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존슨과 그의 정책입안자들은 더 이상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베트남전쟁에본격적으로 참전하는 대신 국내의 개혁정책을 포기하게된 것이다. 107) 물론 베트남전쟁 때문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비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바다 건너의전쟁이 국내의 개혁정책에 찬 물을 끼얹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존슨행정부의 목표였던 ‘위대한 사회’는 미국 내에서 빈곤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지향한 빈곤정책은 기본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통해 절대 빈민의 수를 줄여나가겠다거나 빈곤을추방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108) 차라리 그것은 미국의 막강한 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당시의높은 경제 성장에 근거하고 있었다. 즉 파이를 키워 빈민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었다. 존슨은 1964년 2월 26일 미역사상 가장 큰 세금감면법안에 서명을 했다. 존슨행정부는 116억 달러에 해당하는 개인소득세 92억 달러와 법인세 24억 달러를 줄여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를 원했다. 109) 그러나 경제성장의 상승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있다는 케네디 및 존슨행정부의 경제브레인들의 생각은 지나차게 낙관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예를들어, Heller는 1961년 GNP가 8% 증가한다면 실업률을 6.4%에서 4%로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지만, 사실상 GNP가 무려 15% 증가했음에도 실업률은 0.9% 감소에 지나지 않은 5.5%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110)104) Bernstein, Guns or Butter, 537105) 역사가 Bernstein은 존슨이 월남전 참전을 결정하게된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의 교만(hubris)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있다는 그의 믿음과 64년 대통령선거에서의 압도적승리가 그로 하여금 통치스타일을 바꿔 의회나 여론을 무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Ibid., 542.106) McPherson's Oral History Interview, 3/24/69, Interview Ⅳ, p. 18, LBJ Library; Yarmolinsky's OralHistory Interview, 10/22/80, Interview Ⅲ, pp. 42~43, LBJ Library.107) Gelfand, "The War on Poverty," 127.108) 미국의 소득구조를 피라밋 형태로 놓고 가족별 소득분포를 5 단계로 나누어 보면, 1950년, 1960년, 1975년의 경우, 각 단계의 가족소득의 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e War inPoverty 1965~1980," Wilson Quarter 8 (Autumn 1984), 134 쪽 도표를 볼 것.109) Memo, "Selected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Economy," 3/15/64, folder "3/2/64-3/22/64," Box13, Heller Papers, JFK Library.- 193 -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그 목표는 원대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원적 복지체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또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어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심각하게고려해보고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존슨은 케네디의 예기치 않은 비극적 죽음이 가져온 국가적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대한 이용했다. 그렇게 때문에 의회가 그 자신에게 딴지걸기 전에 여러 개혁적 법안들은 통과시키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존슨은 그의 정책입안자 및 보좌관들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바뀌기 전에 서두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111)위에서 살펴보듯이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제한된 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Katz 교수의지적처럼, 미국에서 “소득을 재분배하거나 보조하는 정부의 정책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는 것으로재정의되기”때문이다. 112) 따라서 존슨행정부의 빈곤추방정책은 이러한 이념적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때문에 존슨행정부의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미국의 복지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지 못했다. 그것은 계층, 인종간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하층사람들에게,흑인들에게,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것은 빈곤상태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직업을 마련해준다거나 새로운 직업을 창출했다기보다는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을 획득시켜 스스로 직업을 찾게끔 했을 뿐이었다.원래 루즈벨트 행정부가 만들어놓은 불완전한 사회복지 체계에 기초했던 존슨행정부의 빈곤퇴치책은 사회보장과 welfare의 이원성을 강화시키고, 인종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그 결과 오히려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사회학자 Theda Skocpol은 60년대 존슨행정부가 뉴딜이 기초한 이원적 복지체계를 극복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사료를 검토해본다면,케네디 및 존슨행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뉴딜적 복지 패러다임 내에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의 기본 전략을세웠다는 것을 알게 된다. 113)‘<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을 입안한 사람들의 빈곤에 관한 기본시각은 혁신주의시대 개혁가들이나 뉴딜정책을 집행한 사람들과 거의 동일했다. 즉, 빈곤의 원인을 미국의 불평등한 소득구조와는 연관시키지 않고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은 20세기 내내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따라서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조차도 “가난한 미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변화시키려는 어떠한 현실주의적 공약(realistic commitment)”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114) 그렇기 때문에 빈곤문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교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이라는 60년대 미국의 복지정책의 개혁이 갖는 한계성이 드러난다. 전통의 무게는 여전히 정책결정자나 정책브레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strong>빈곤과</strong>의 전쟁’은 미국적인 개혁의 보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이다.110) Bernard Gifford, "War on Poverty," in Kaplan and Cuciti, eds., The Great Society and It' Legacy,62~63.111) Cohen의 증언에 의하면, 존슨은 64년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자마자 각료 및 보좌관들을 모아놓고 의회와의 밀월관계가 끝나기 전에 가능한한 빨리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 의회에 보내야한다고 독촉했다.Cohen's Oral History Interview, 3/29/69, Tape 3, p. 16, LBJ Library.112) Katz, Improving Poor People, 57.113) Skocpol, "Limits of New Deal System," in her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222.114) Gifford, "War on Poverty," 64.- 194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정치:토론1(별첨)토론자 : 강명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95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정치:토론2(별첨)토론자 : 이문국(안산공대 교수)- 196 -
□ 이 글은 최초로 원내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노동계층, 빈곤층, 취약계층을 위한 빈곤대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약 3년의 시간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대중적 기대감에 부응할 수있는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구체적인 결과로서 보여주어야 하는 시간임- 특히 국회에 진입한 정당으로서 지금까지 표방해 왔던 이념과 원칙에 옷을 입히는 정책입안및 추진 역량을 입증해야 할 것임. 이는 선언에 집중하기보다 정책실현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의미함□ 현재 우리사회는 빈부격차 확대와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통합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는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문제에 대한 입법과제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하지만 성급한 마음에 각각의 사안에 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 현재 복지정책은 법과 제도의 과잉 속에서 제도의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향후 입법과제는 빈곤을 예방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다층적인 지원체계, 이러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과 재원을 고루 갖추려는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그리고 입법의 기본방향과 관련해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주거, 의료, 생계)에 대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전제로 빈곤대책의 입법화를 고민해야 함□ 하지만 각종 빈곤대책 마련에 있어 사회적 합의 또는 지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지난 수년간 빈곤대책과 관련된 많은 개선노력이 좌절된 이유를 살펴보면,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빈곤대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빈곤대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동력 또는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함- 현재의 빈곤대책은 빈곤층에 초점을 둔 잔여적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시민은 이를 자신과- 197 -
무관한 것으로 느끼고 있음. 하물며 이 제도가 자신이 처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사실에는 더욱 둔감함- 따라서 빈곤대책은 각종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수립되어야 하며, 이것이 빈곤층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홍보해야 함□ 결국 빈곤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복지경험을 통한 사회적 교육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는 잔여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빈곤대책의 강화를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의미함- 빈곤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시민사회, 정당,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명확한 정책이념을 가진 정당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음- 그리고 빈곤대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 따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 집단의 조직적인 결합이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 글은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문제의 현황과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민주노동당이 고민해야 할 입법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물론 매우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향후 법안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요구하는경우도 있을 것임 □ 최근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문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한 사회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소 천편일률적인 측면이 있음- 물론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의 원인을 산업․경제․노동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 하지만 <strong>양극화</strong>를 야기하는 사회․정치적 원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strong>빈곤과</strong> 배제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됨- 또한 <strong>양극화</strong> 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한다는주장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현 사회보장체계가 기존 빈곤층중 일부만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제도개혁과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 그렇다면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빈곤문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함- 먼저 <strong>양극화</strong>는 으로 이해할 수 있음. 등다양한 측위에서 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방위적으로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가 나타나고,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하지만 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가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을 야기하는 유일한 원인인 것처럼 과장해서는안됨. 산업․경제․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가 빈곤으로 나타나기까지 다른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그 과정을 풀어보면, 노동을 통한 1차 소득분배의 왜곡은 조세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 198 -
배과정을 통해, 그리고 기타 빈곤대책 및 빈곤예방대책을 통해 최종적인 빈곤상태로 나타나게됨- 따라서 <strong>양극화</strong> 문제는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정책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산업․경제․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는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초래하는 일차적인 원인이고, 사회의 모든 층위에서 발생하는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현재의 <strong>양극화</strong>는 첨단산업과 사양산업간의 <strong>양극화</strong>,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strong>양극화</strong>, 취업자와미취업자 간의 <strong>양극화</strong>,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strong>양극화</strong>, 고수익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 간의 <strong>양극화</strong>, 성장지역과 낙후지역 간의 <strong>양극화</strong>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중층적 <strong>양극화</strong>현상이며, 이는 근로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로 표현됨- 이 과정에서 노동자 중에도 Insider와 Outsider가 발생하며, Outsider들은 사양산업 및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로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노출되어 있음․이 점에서 <strong>양극화</strong> 현상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신빈곤’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 신빈곤이란 동일한 빈곤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새로운 빈곤현상 또는 빈곤생산메커니즘에 대한 해석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그것은 <strong>양극화</strong>가 담고 있는 다양한 모순이 응축된 것으로 ‘노동하는 자의 빈곤’, 즉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가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나 빈곤을 초래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님. 취약한 소득재분배 정책,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 자산불평등의 심화, 과도한 지출을 강제한 각종 사건 등이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을 초래하고 있음- 먼저 전통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던 집단에서 빈곤․소외계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독거노인, 방기된 아동, 가족해체를 경험하는 노숙자 등이 그들임. 이는 인구․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적 안전망의 약화 또는 붕괴현상을 의미하는 것임․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해서 한국사회에서 사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높게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그 비중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자산불평등 또한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음. 각종통계자료를 통해 소득기준 지니계수에 비해 자산기준 지니계수가 크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우리사회에서 자산은 매우 높은 수익실현을 통해 자산의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왔음. 더욱이자산이 빈곤을 예방하는 빈곤쿠션(Poverty Cushion)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이 또한 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심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함- 끝으로 저소득층의 가계에 큰 부담을 안겨주는 지출요인을 소득<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의 원인으로 간주해야 함. 대표적인 예로, 주거비 상승에 따른 부채의 증가, 절박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지출 및 부채의 증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은 빈곤의 결과일 뿐 아니라 빈곤을 심화시키는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음․우리사회에서 중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연구와 제안은 끊임없이 있어 왔음. 그리고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통해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례가 발견되어 왔음□ 그리고 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가 빈곤문제의 심화로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조세체계 및 사회보장체계의 취약성을 들 수 있음.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보장체계는 압축성장을 경험하였으나,- 199 -
여전히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고 사각지대가 크다는 한계를 안고 있음-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은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세전․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한국사회에서 조세 등 각종 재분배정책이 소득<strong>양극화</strong>와 빈곤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줌- 또한 취업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지난 수 십 년 간 고도성장을 통해 대량의 저임금일자리를 창출했던 경험은 고용지원사업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이는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의미함- 그리고 사회보험의 미성숙 문제를 들 수 있음. 현재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매우 큰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음. 이는 이들중 상당수가 실직에 따른 빈곤화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노인빈곤의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함- 끝으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불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물론 현재 공공부조제도에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이 가도록 짜여져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자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함. 하지만 공공부조의 지출규모 또한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수준임․1인 당 GDP가 1만불에 (재)진입했던 2001년, 한국의 공공부조지출이 GDP의 약 0.5%를 차지했다면, 다른 OECD국가들이 1만불에 진입했던 1980년을 전후한 시점에 그들의 공공부조지출은 GDP의 1.5% 수준이었음- 그 밖에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급 또한 매우 취약하다고 말할 수 있음. 물론 외환위기 이후 지역 민간단체를 통해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이 또한 지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위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노동․소득의 <strong>양극화</strong> 과정에서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그 규모는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률은 외환위기 직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다 2000년을 기점으로 차츰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03년 5.7%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200 -
[그림 1] 1996년 이후 실업률과 빈곤률 추이빈곤률실업률(%)12108642(%)0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년간), 각 년도- 외환위기이후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도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지니계수 또한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2]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자료 : 한국은행, ‘경제<strong>양극화</strong>의 원인과 대책’, ‘04년 11월- 그리고 빈곤층은 낮은 자산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과도한 부채, 부채상환의 잦은 연체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빈곤층 규모추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관련 통계자료가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자료가 아니라는 점임-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임금근로자 가구를대상으로 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전체 인구에서 약 30~4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있음. 이는 빈곤률 추정과 관련해서 빈곤층 비율이 높은 1인 가구, 미취업가구, 농어촌가구, 자영자 가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소 추정의 위험이 있음- 201 -
-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으나, 조사가 월 또는 분기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득분배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2001년 발표된 2000년 시점의 소득자료임- 또한 빈곤층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있음. 사회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욕구 및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함□ 빈곤선과 최저생계비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최저생계비는 Market Basket 방식으로 계측되고 있으나, 이를 상대빈곤선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소득계층 구분과 관련해서 차상위층이라는 개념 또한 매우 자의적임. 어떠한 근거에서최저생계비의 120%까지가 차상위층인지 논거를 찾을 수 없음․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중위소득을 빈곤선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제비교를 위해서도 중위소득을 기준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성별은 빈곤층과 차상위층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며, 연령은 빈곤층이48.26세 차상위층이 39.91세로 전체 평균 연령 35.1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학력은 빈곤층과 차상위층의 경우, 무학과 초졸 학력자의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가구규모는 빈곤층이 2.87명, 차상위층이 3.31명으로 전체 평균 3.65명에 비해 낮게나타나고, 가구형태는 빈곤가구의 경우, 노인부부가구 및 단독가구의 비율이 높고, 일반가구의비율은 3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 -
소득계층별 가구형태성별연령학력가구규모가구형태빈곤층 차상위층 차차상위층 비빈곤층 합계남 43.4 45.3 50.2 49.6 48.8여 56.6 54.7 49.8 50.4 51.20~5세 4.4 7.3 11.8 7.2 6.96~10세 4.9 7.6 6.6 8.0 7.611~15세 6.8 6.2 7.5 7.3 7.216~20세 6.1 7.6 8.2 6.6 6.621~25세 2.5 3.9 4.3 7.2 6.526~30세 2.6 5.1 7.3 8.5 7.731~35세 3.7 5.1 7.3 9.0 8.236~40세 5.7 7.1 9.1 9.3 8.841~45세 5.8 6.6 8.2 9.8 9.246~50세 4.2 6.0 3.8 7.8 7.351~55세 4.3 4.4 5.2 6.1 5.856~60세 5.0 6.8 3.9 4.3 4.561~65세 9.6 8.3 6.4 3.7 4.666~70세 13.1 9.8 5.4 2.3 3.871세 이상 21.5 8.3 4.8 2.8 5.1평균연령 48.26 39.91 33.90 33.30 35.19무학 35.5 24.3 21.0 15.1 17.9초졸이상 26.8 23.5 21.4 14.0 15.9중졸이상 15.5 18.9 17.1 13.7 14.2고졸이상 16.3 23.0 31.1 30.9 28.9전문대이상 2.8 6.6 6.4 10.0 9.0대졸이상 2.9 3.1 2.3 14.7 12.7대학원이상 .2 .7 .7 1.6 1.41명 15.3 9.2 .8 3.8 5.22명 33.9 23.1 17.9 11.1 14.23명 19.6 17.5 33.9 21.4 21.34명 17.1 33.7 30.6 41.2 38.15명 8.9 10.7 10.1 16.0 14.96명 4.0 5.5 2.3 4.5 4.47명 1.2 .3 4.4 2.0 1.9평균가구원수 2.87 3.31 3.57 3.77 3.65일반가구 33.6 56.0 64.1 78.3 72.3부부가구 27.1 17.2 12.1 8.4 10.8모자가구 5.2 4.5 5.1 .9 1.6부자가구 2.3 1.3 2.0 .4 .7단독가구 15.2 9.1 .8 3.8 5.2소년가장 .1 .0 .0기타 16.5 12.0 15.8 8.2 9.4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 □ 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은 향후 빈곤대책의 집단유형별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안겨줌- 전체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자가 1인 이상 포함된 빈곤가구는 47.2%를 차지하며, 전체 빈곤층 중 15~65세의 근로능력자는 31.9%, 이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을 합하면 전체- 203 -
빈곤층의 61.8%임- 반면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근로무능력 빈곤층은 가구비중으로는 전체 빈곤층의 52.8%를 차지하지만 가구규모가 작아 인구수로는 38.2%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근로빈곤층 규모최저생계비 기준빈곤층중위소득 60% 기준빈곤층협의의근로빈곤층광의의근로빈곤층(단위 : 빈곤가구 및 빈곤가구원의 %)근로무능력빈곤층합 계가구 47.2 52.8 100.0개인(명) 31.9 61.8 38.2 100.0가구 55.2 44.8 100.0개인(명) 36.8 69.6 30.4 100.0주 :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 60%기준을 에 적용하여 추정한 전체 빈곤층 비율에서 근로빈곤층의 비율을 가구 및 개인단위로 추정자료 : 노대명(2005), ‘<strong>양극화</strong>시기의 근로빈곤층 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에서 인용□ 빈곤층의 실태는 취업상태, 소득, 지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부분은 저임금․고용불안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에 제약을 받게 됨. 하지만 반대로 소득은 빈곤선 이상이나 특정 항목에서 과도한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른 항목의 소비에 제약을받는 경우가 발생함- 따라서 빈곤층의 취업실태를 통해 빈곤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빈곤가구의 의료비 부담정도를 파악하고, 자산 및 주거비 지출비중을 통해 빈곤가구의 주거불평등 또는 주거빈곤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함□ 2002년 시점에서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빈곤층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다음과같은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소득계층별 취업상태을 보여주는 통계청 데이터가 없어 자료를 활용하였음- 빈곤층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42.4%, 차상위소득 이상 비빈곤층 중 임금근로자의비율은 66.8%에 이르고 있음.- 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무려 94.5%에 달하는 반면, 차상위소득 이상 비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51.8%로 나타남- 빈곤층 비임금근로자 중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31.6%로 비빈곤층25.4%에 비해 약 5.8%가량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비빈곤층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 4.7%로 나타난데 비해, 빈곤층의 실업률은22.4%로 비빈곤층 보다 약 4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204 -
빈곤층의 취업실태주된활동임금 vs 비임금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 근로빈곤층2002년도 빈곤층빈곤층 차상위층 비빈곤층 전체임금근로자 35.7 13.0 28.7 41.6 37.7비임금근로자 22.9 16.4 17.0 15.1 15.2실업자 18.7 8.9 7.9 3.1 3.9비경제활동인구 41.4 60.4 45.6 35.0 38.4임금근로자 60.9 42.4 62.0 66.8 65.1비임금근로자 39.1 57.6 38.0 33.2 34.9상용직 12.2 5.5 15.3 48.2 45.6임시직 33.3 24.6 34.5 31.0 30.8일용직 54.5 69.9 50.2 20.8 23.6고용주 2.9 1.8 1.5 14.2 12.5비임금근로자자영자 62.0 66.6 70.3 60.4 61.4종사상 지위무급종사자 35.1 31.6 28.2 25.4 26.1실 업 률 24.2 22.4 14.5 4.7 6.4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년주 : 빈곤층은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를 포함하여 취업실태를 나타낸 것임□ 위의 빈곤층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노동의 <strong>양극화</strong>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가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냄. 그리고 위의 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노인․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나 차별로 인해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빈곤층 중 근로능력자를 중심으로 취업상태에 따른 소득과 자산 그리고 부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남- 근로소득은 취업자 중에서는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낮고, 부채는 자영업자와 실업자가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근로빈곤층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할 때,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57.1과 42.8에 불과하며, 자영업자 또한 76.4%에 불과함- 그리고 근로빈곤층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부채를 100으로 할 때,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108.6과 97.8로 나타나고, 자영업자는 166.0, 실업자는 122.5로 나타남. 실업자는저축이나 자산이 없어 부채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근로빈곤층의 취업상태별 소득 및 부채비교(단위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주 자영자실업자근로소득 100.0 57.1 42.8 184.8 76.4 1.2자 산 100.0 60.6 41.2 236.5 98.0 83.0부 채 100.0 108.6 97.8 428.8 166.0 122.5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2003□ 빈곤층의 보건의료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205 -
- 빈곤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1인당 월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은 22,716원으로 비빈곤가구의27,284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월 평균 보건의료비 지출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빈곤가구의 경우 월 평균19.44%로, 비빈곤층의 5.4%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비빈곤가구의 지출수준이 높지만 그것이 가계에 주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점을말해줌- 비수급 빈곤․차상위가구는 의료비 지출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수급 빈곤가구의 약 2배, 비빈곤가구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소득이 낮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떨어지며, 그 나마도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115) 빈곤층 및 차상위층1인당 의료비(원)최저생계비 대비의료비 비중(%)경상소득 대비의료비 비중(%)소계 수급가구 비수급가구비빈곤층평균 22,716 33,241 20,144 27,284중위 5,625 6,000 5,333 7,375평균 8.17 11.59 7.33 13.42중위 2.06 2.21 2.05 3.48평균 19.44 11.94 21.36 5.40중위 2.60 2.39 2.67 1.51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 2003년(년간)□ 빈곤층의 의료비 지출실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 가구 중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의료비가 없어 질환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빈곤층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빈곤층의 주거실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빈곤층의 주거실태와 관련해서 빈곤가구 및 차상위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자가보유 가구의 비율이 낮고 월세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아래 에 따르면, 빈곤가구 및차상위가구의 월세가구 비율은 24.7%인 반면, 비빈곤가구의 그것은 1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15)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은 가구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의 존재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균치는 매우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6 -
빈곤층의 입주형태(단위 : 가구의 %)전체 빈곤층 및 차상위층 비빈곤층자가 57.8 42.1 57.8무상 2.2 4.5 2.2사택 1.9 1.2 1.9전세 26.9 27.5 26.9보증부월세 9.7 18.9 9.7사글세 .8 2.4 .8월세 .8 3.4 .8전체 100.0 100.0 100.0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 2003년(년간)- 그리고 경상소득 및 최저생계비에서 평균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해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가구규모별 절대금액에 있어 비빈곤가구의 월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하지만 경상소득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빈곤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월세부담이 약 3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빈곤층의 월세 부담정도최저생계비 대비월세 비율경상소득 대비월세 비율(단위 : 가구의 %)빈곤층/차상위층 비빈곤층평균 17.9814 21.6503중위 15.4984 17.8828평균 29.2637 9.1873중위 18.1818 7.4320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자료, 2003년(년간)□ 앞서 언급한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취업실태, 의료비 및 주거비 지출실태를 정리하면, 다음과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먼저 취업실태와 관련해서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가 빈곤층에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실업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음- 둘째, 의료비 및 주거비와 관련해서는 빈곤층의 지출부담이 비빈곤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셋째,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층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과 관련해서 수급 빈곤층에 비해지출부담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07 -
□ 빈곤층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음- 먼저 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미가입자 규모가 크고, 고용보험과산재보험의 경우, 5인 미만 영세사업자 종사자의 미가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이어 빈곤층에 대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사각지대 규모가 큰 것을알 수 있음. 아울러 기타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큰 규모로 나타남□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아래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먼저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의 40.5%로 추정되며,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자 비율은 7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재 연금가입연령의 빈곤층 중상당수가 미래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이어 산재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자의 비율은 27.4%로 추정되며, 빈곤층 중 미가입자 비율은 63.1%로 나타나고 있음. 산재보험 미가입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장 종사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밀집된 빈곤층에서 미가입률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음- 또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자의 비율은 57.8%로 추정되며, 빈곤층 중 미가입자의 비율은 86.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빈곤층 임금근로자의94.6%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음- 끝으로 건강보험 가입대상 중 미가입자 비율은 0.3%로 전국민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보험료 연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회보험 가입․미가입 실태연금가입여부산재보험가입여부고용보험가입여부건강보험가입여부주 : 전체 소득계층의 %전체최저생계비 120%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비빈곤층 차상위층 빈곤층 비빈곤층 빈곤층국민연금 54.2 57.6 28.5 20.4 54.2 20.5직역연금 5.2 5.8 0.3 0.4 5.2 0.5미가입 40.5 36.6 71.2 79.2 40.5 79.0계(수) 100.0(12,503)100.0 100.0 100.0 100.0 100.0(11,174) (390) (939) (11,389) (1,114)가입 72.6 74.8 50.1 36.9 74.4 39.2미가입 27.4 25.2 49.9 63.1 25.6 60.8계(수)100.0(7,813)100.0(7,231)100.0(213)100.0(369)100.0(7,365)100.0(448)가입 42.2 43.9 24.7 13.1 43.5 15.3미가입 57.8 56.1 75.3 86.9 56.5 84.7계(수) 100.0(7,737)100.0(7,204)100.0(206)100.0(327)100.0(7,334)100.0(403)직장가입 53.3 55.6 37.7 35.6 55.1 34.2지역가입 46.3 44.1 60.9 63.1 44.3 64.3미가입 0.3 0.2 1.4 1.3 0.2 1.5계(수) 100.0(26,714)100.0(23,176)100.0(944)100.0(2,594)100.0(23,772)100.0(2,942)(단위: %, 명)- 208 -
자료 :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시한 공공부조제도는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매우 중요한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매우 큰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음.- 아래 [그림 3]은 2003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빈곤률(5.7%)과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빈곤률(10.3%)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한 것임- 그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는 약 143만명에서 420만명까지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음. 이는 빈곤률 추정치에 따라 사각지대 규모가 크게 달라지며, 그에 따른 정책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그림 3] 공공부조제도의 빈곤층 보호 규모 (2003년 현재)비빈곤층최저생계비의120% 차상위층(155만명)최저생계비기초보장 수급자130만명비수급자143~420만명기타범주적공공부조51만명□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음- 비수급 빈곤가구의 34.6%, 개인의 33.3%가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충족여부가구규모별 재산기준(가구)(단위 : 가구 및 개인의 %)가구규모별 재산기준(개인)초과 미달 소계 초과 미달 소계가족을 통한 있음 20.3 32.3 52.6 21.4 30.5 51.9사적이전소득 없음 12.8 34.6 47.4 14.8 33.3 48.1합 계 33.1 66.9 100.0 36.2 63.8 100.0자료 :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년주 : 재산기준은 재산총액을, 부양의무자 기준은 사적이전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하는 기준에 정확하게 부함되는 것은 아님 □ 빈곤층 사회보장제도가 직면한 기타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복지재원의 한계 : 복지국가를 향한 첫 걸음은 에 대한 공평한 배분에서 시작됨.- 209 -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1인당 GDP가 증가하면 <strong>빈곤과</strong> 분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확실성을 보장할 수 없음. ==> 이 점에서 현 단계에서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유세와 같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정부예산 중비중이 과도한 부문의 예산을 사회복지부문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는 을 위한 비젼제시를 전제로 함-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취약성 : 현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정규직 남성노동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조절(regulation)은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능임. 이 점에서 비정규노동의 확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을 넘어 추가임금을 부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교육훈련, 취업연계, 고용유지 등과 관련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원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지서비스의 잔여성 : 현재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국가의 시혜 또는 잔여적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strong>양극화</strong>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집단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이는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파편화 :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제도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전달체계를 강화하고, 각 전달체계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데 소홀해 왔음. 그 결과, 현재의 전달체계로 복지수요을 충족시키는데 심각한 한계에 처해 있음 ==>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기존의one-stop service에서 점진적으로 조직간 연계를 강화하는 any-stop service 116) 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전달체계의 상당부분을 민간이 담당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위탁에 따른민관협약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음□ 빈곤층 대상집단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비젼과제도가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기초보장의 취약성 : 현재 노인빈곤층 및 장애빈곤층 중 많은사람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 이유가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규정에 따른 것이나, 최근 우리사회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왔던 빈곤층 노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함- 아동에 대한 사회권 보장의 취약성 : 한국사회에서 아동빈곤의 문제는 빈곤의 대물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그리고 가족관계 내에서도 아동의 방기․학대 등이 끊임없는 문제를 야기하고있음. 실제로 가구단위 기초보장을 하더라도 아동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함 ==>아동의 사회권을 개인단위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부모에 대해서는 부양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도 수반되어야 할 것임- 근로빈곤층 및 근로희망자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방식의 소극성 : <strong>양극화</strong> 과정에서 노동의 공급측면만을 강조하는 인적자본개발의 입장은 수요측면의 구조적 변화를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근로빈곤층과 노인․장애인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개발전략 뿐 아니라,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s)를 제공할 수 있는 수요측면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그리고 이116) 이 표현은 강혜규 박사의 전달체계 개편방안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혀 둠- 210 -
와 관련해서 사회적 일자리 등은 저임금의 단순노동에서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半 숙련노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노숙자 및 외국인노동자 등 한계집단에 대한 배제 :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여전히 국적에 따른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주소나 신분증이 없는 노숙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사회보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들 한계집단은 국경을 넘어선 사회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사회보장체계 안에 통합해야 함□ 정책영역별 사회보장정책의 취약지점 또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음. 이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주거보장의 취약성 : 빈곤층의 일차적 복지욕구라고 말할 수 있는 주거욕구는 자산불평등이심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 최근 임대주택 건설은 이러한 문제에 비추어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주거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층에게는 임대주택 입주지원 외에도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주거수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되어 있는 주거급여를 현실화하고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미함- 의료보장의 취약성 : 우리사회에서 질병은 빈곤의 원인이자 빈곤의 결과임. 질병으로 인해소득이 감소하고 지출이 증가하여 빈곤해지는 경우는 주변에서 수 없이 목도하는 사례임. 그리고 빈곤층은 소득부족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빈곤층에대한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급여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의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전 국민의료보장을 위해 건강보험제도의내실화 또한 필요할 것임- 교육보장의 취약성 :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strong>빈곤과</strong> 빈곤대물림에 큰 영향을 미침. 그러나 우리사회의 교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는 공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사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가 운영되는 것에서 비롯됨 ==> 따라서 공교육의 기능강화를 전제로 무상교육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 문제와관련해서는 보다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지지기반 구축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민주노동당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사회적 지지기반을확충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리고 이 맥락에서 입법작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여야 함-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천명하는 것과 단기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것을 구분하고, 전략적인선택과 집중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함□ 먼저 빈곤대책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으나, 빈곤대책 추진의 환경조성이라는 차원에서 입법의제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언급하면 아래와 같음-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의 법제화 : 현재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각종 법안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정이 요구됨.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빈곤층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이를 위한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의미함. 현재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빈곤층 지원사업을 통합 또는 연계하는 것은 빈곤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211 -
- 복지재원 확충 :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복지지출의 확대속도와 빈곤층의 복지욕구를비교할 때,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부유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있음. 하지만 법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SOC분야에 집중된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이는 토건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중요한 변화가 될것임- 비정규직 관련 법안 :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정하여 노동시장 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이들에게 사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보험규정을 개정해야 함- 지역차원의 고용․복지 통합인프라 구축 : 현재 고용․복지서비스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으로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지역의 수요자와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고용․복지통합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거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함. 특히 고용인프라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의한 재정부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 현재 잔여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복지간병, 가사도우미, 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뒤에 언급할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등을 통한 서비스 수요창출이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일반 실직자 및 빈곤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인증 등을 수행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어 좀더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입법과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정 : 현재 고용보험을 실업보험으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험가입을 촉진하고, 각종 고용지원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충하는 법률개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리고 산재보험은 영세자영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법률개정과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유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 : 빈곤대책 중 가장 핵심을 이루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양한 빈곤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함. 현재 통합급여체계에 묶여 있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을 분리하여, 그것이 빈곤층 수급자 뿐 아니라, 저소득층 및 기타 취약계층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함. 그리고 부양의무자 규정 또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폐지해야 함. 결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은 뒤에 언급하고 있는 각종 법률제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음- 빈곤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강화 : 빈곤노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볼수 있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빈곤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방법 외에도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수 있음- 의료급여법의 개정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빈곤층 및 의료비 과다지출 가구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한 강구할 필요가있음- 자활지원법의 제정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자활사업을 실직 및 불완전취업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자활지원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탈빈곤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법의 제정 :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독립함- 212 -
으로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며, 주거비지불능력이 취약한 집단에 대한 주거보장을 강화하는주거급여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 심각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와상노인 등의 보호를 위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 관한 법률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이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임□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다양한 입법과제 중 어떠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타 법률제정 및 개정작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음- 213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종합토론:토론1(별첨)토론자 :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의원단 수석부대표)- 214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종합토론:토론2(별첨)토론자 : 고경화(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215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종합토론:토론3(별첨)토론자 : 권혁철(자유주의연대 정책위원장,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216 -
일하는사람들의희망민주노동당종합토론:토론4(별첨)토론자 : 안병룡(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