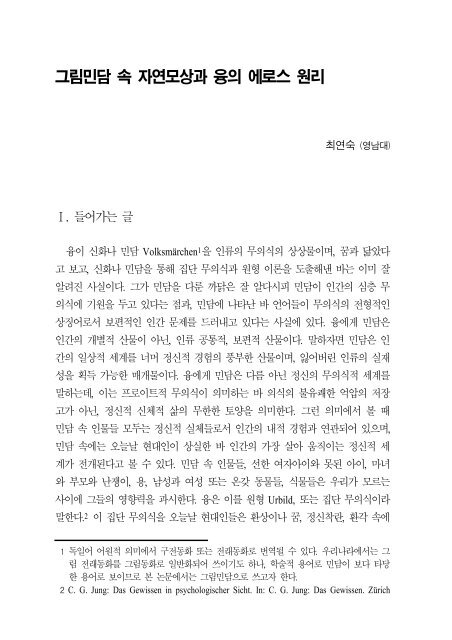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그림민담</strong> <strong>속</strong> <strong>자연모상과</strong> <strong>융의</strong> <strong>에로스</strong> <strong>원리</strong> 277<br />
원지대, 산악지대, 우물 <strong>속</strong>, 꿈 <strong>속</strong> 등에서 나타나며, 동물 또는 식물의 형태로 변신<br />
하기도 하는 초자연적 모습을 띤다. 나무로는 사과나무, 노간주나무, 오리나무, 개<br />
암나무 등이 모성 또는 여성성을 띠며 자연모의 상징을 드러내며, 동물로는 염소,<br />
산양, 오리, 비둘기(하얀 비둘기), 또는 두꺼비 등이 그 기호적 의미를 띠면서 그림<br />
민담 <strong>속</strong> 의미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자연모의 다양한 모습을 그 유형별로 가름하<br />
기 힘드나, 대충 세 가지 유형, 첫째, 나쁜 <strong>자연모상과</strong>, 둘째, 착한 자연모이나 악과<br />
공생 중인 경우, 셋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전형적인 자연모상으로 나누어<br />
볼 수 있다.<br />
Ⅱ.1. 마녀상<br />
첫째 번의 나쁜 자연모상은 이른바 마녀들이다. 이러한 마녀상은 악한 인물상<br />
을 드러내는데, 물질적 요소가 지배적이며, 선악의 구분이 모호하며, 4의 숫자와<br />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민담의 무수한 주인공들이 마녀들의 마술에 걸려든<br />
다. 마녀의 마술에 의해 인간들은 궁지에 빠지게 되고, 악이나 죽음에 직면하게<br />
된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바 <strong>그림민담</strong>, 헨젤과 그레텔 Hänsel und Gretel 15<br />
에 나오는 숲 <strong>속</strong> 마녀가 그러한 경우일 것이다. 이외에도, 독일민담에는 악한 자<br />
연모가 많이 등장하는데 용광로 Der Eisenofen 127의 늙은 마녀가 그 예다. 숲<br />
<strong>속</strong> 할머니 Die Alte im Wald 123나 수수께끼 Das Rätsel 22에 나오는 나쁜 마<br />
녀는 주인공에게 마술을 걸어 나무로 만들거나, 주인공 왕자에게 독이 든 음료수<br />
를 마실 것을 권한다. 그러나 마녀의 마술은 주인공이 풀어야 할 어려운 과제로<br />
나타나며, 이러한 과제를 풀어야 할 때도 마녀는 오히려 방관적 태도를 보이거나,<br />
또는 암시적 미끼를 던지기까지 한다. 수수께끼 에서 독이 든 음료는 단순한 소<br />
재적 의미를 띠지 않고, 아름답지만 거만하기 이를 떼 없는 공주가 풀어야 할 수<br />
수께끼의 열쇠가 된다. 민담 <strong>속</strong> 선과 악의 도덕적 구분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이<br />
민담에서와 같이 오히려 악이 악의 연쇄적 고리를 끊어내고, 공주의 대립적 기질<br />
인 거만함을 잠재워 왕자의 행복한 결혼을 실현시키는, 보다 궁극적 힘으로 나타<br />
난다. 인간은 이 민담에 나오는 12명의 살인범처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br />
일 수 있으며, 이러할 때 악은 인간이 욕망의 포로임을 깨닫고 경험케 하는 보다
<strong>그림민담</strong> <strong>속</strong> <strong>자연모상과</strong> <strong>융의</strong> <strong>에로스</strong> <strong>원리</strong> 281<br />
으며, 그것이 모성적, 여성적 <strong>원리</strong>로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br />
맛있는 죽 에서는 숲과 여성성이 연계되어 함축적 상징성을 드러낸다. 이 민<br />
담에 나오는 세 여성은 모두 각기 다른 존재적 의미를 띠고 있다. 너무 배가 고<br />
파 그 허기를 달래고 싶어 하는 소녀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숲<br />
으로 들어간다. 숲 <strong>속</strong>에 사는 할머니는 작은 냄비를 주며, 배고픔을 해결해주는,<br />
<strong>융의</strong> 이른 바 자기적 존재라 할 수 있다. 숲은 융이 밝힌 바, 무의식의 육체적<br />
정신적 관점을 드러낸다. 말하자면 숲 <strong>속</strong> 나무들은 육체를 상징하는 흙과 직접<br />
연관된 생명체들이다. 흙에서 양분을 취하며 숲은 성장한다. 숲은 모든 것을 성<br />
장시키는 공간이며, 인간의 지배체계를 벗어난, 인간의 질서나 계획과는 무관한<br />
세계다. 여기서 숲은 외눈박이... 와 암송아지 에 나타나는 사과나무가 살아 숨<br />
쉬며 성장하는, 뭇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발화하고 살아 숨쉬는 거소다. 숲 <strong>속</strong> 할<br />
머니가 주는 작은 냄비는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총, 어머니 자연의 베풂인<br />
것이다. 이 민담에서 주목되는 것은 자연의 선물인 냄비를 다루는 어머니와 딸의<br />
차이점이다. 딸이 냄비를 다룰만한 능력을 지녔다고 본다면, 어머니는 <strong>융의</strong> 의미<br />
에서 볼 때, 딸의 그림자다. 자연모의 선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를 지나<br />
쳐 무절제하게 사용된다면, 위대한 자연모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 된다. 어느 의<br />
미에서 숲 <strong>속</strong> 할머니의 무궁무진한 베풂은 인간이 자연의 선물을 제대로 수용할<br />
줄 알 때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br />
Ⅱ.4. 자연모상의 상징적 기호체계<br />
위의 세 번째에 해당하는 자연모상은 독일 민담에서 상징적 기호화 단계를 보<br />
여준다. 예를 들어 외눈박이... 의 염소와 그의 내장과 사과나무, 암송아지 의<br />
꼬리와 뿔과 발굽과 사과나무, 맛있는 죽 에서의 숲 등은 숲<strong>속</strong> 집 Das<br />
Waldhaus 169에서 숲과 암소와 뿔, 황금새 Der goldene Vogel 57에서 보름달<br />
과 황금새와 여우의 꼬리와 황금, 강철한스 Der Eisenhans 136에서는 우물과 황<br />
금 손, 황금 머리, 황금 사과, 우물가 거위치기 Die Gänsehirtin am Brunnen 179<br />
에서는 숲, 거위, 우물, 사과나무, 보름달 등과 연계되면서 의미폭을 확대시키고<br />
있다. 이러한 의미폭은 홀레부인 에서는 우물과 실패, 연못 <strong>속</strong>의 물의 요정 에<br />
서는 연못과 황금 빗, 황금 피리, 황금 북과 보름달 등과 연관성을 띠면서, 단어
Ⅴ. 마무리 글<br />
<strong>그림민담</strong> <strong>속</strong> <strong>자연모상과</strong> <strong>융의</strong> <strong>에로스</strong> <strong>원리</strong> 291<br />
이리가레이의 다양하고 초월적인 모성 개념과 생태 페미니즘에서 다루고 있는<br />
자연모에 대한 연구는 융에 의해 연구된 바 유럽의 일방적인 부권질서에 의해<br />
배제된 여성과 자연에 대한 단초들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민담 <strong>속</strong>에는 자연<br />
에 대한 인간의 경외심과 그 문제성이 풍부하게 표현, 전승되고 있다. 융이 밝혀<br />
낸 바 민담 <strong>속</strong> 자연 또는 자연모에는 기독교적 의식에 의해 타자화된 세계에 대<br />
한 기록과 함께, 자비롭고 치유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서, 자연과 육체를 결합하<br />
는 정신성의 발생지 Geburtsstätte가 확인된다. 말하자면 이는 융이 무의식에 대<br />
한 연구과정에서 확인한 바 무의식의 경향, 즉 여성적 <strong>원리</strong>를 통해 로고스적 일<br />
방성을 온전케 하는 창조적인 재생의 지점을 뜻한다. 민담 <strong>속</strong> 자연모는 대립을<br />
분리시키는 로고스라기보다 대립을 묶는 <strong>에로스</strong>로서 인격화되어 있으며, 육체적<br />
세계가 정신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제시됨으로써, 자연의 탈신화화를 <strong>에로스</strong>적 원<br />
리, 즉 여성성으로 재구성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지나 자연의 특징을 담고<br />
있는 신화 <strong>속</strong> 여신이나 민담 <strong>속</strong> 자연모상은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과 자연, 즉 육<br />
체의 유추를 통해 여성적 가치를 확인하게 한다. 자연모는 정신과의 관계를 매개<br />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합일을 향한 대립을 야기시키기도 하나, 철저히<br />
육체나 자연과 합일 상태에서 정신을 포괄하는 여성성 <strong>원리</strong>를 드러낸다. 이러한<br />
여성적 <strong>원리</strong>는 이리가레이의 초월적 모성 개념과 생태적 여신숭배와 연관되어<br />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리가레이가 말하는 바 남근중심사회나 이성중심주의,<br />
또는 생태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바 자본주의체제나 가부장제 지배질서는 융이<br />
말한 바 일방적 로고스 <strong>원리</strong>와 같은 맥락에서 확인되는 바이며, 그 대안적 의미<br />
또한 여성과 자연 개념에서 찾고 있다. 물론 이 여성과 자연의 공식 <strong>속</strong>에서 무수<br />
한 페미니즘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리가레이가 말하는 바 치<br />
유의 언어, 즉 모성의 언어나, 여신숭배의 영성 연구는 민담 <strong>속</strong> 자연모가 드러내<br />
는 창조적 <strong>원리</strong>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며, 바로 이러한 점이 앞으로<br />
자연과 여성의 논의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 보여진다.
292 독일문학 제87집<br />
참고문헌<br />
1차 문헌<br />
Grimm, Brüder: Kinder- und Hausmärchen. Stuttgart 1984.<br />
Hesse, Ninon(Hrsg.): Deutsche Märchen vor und nach Grimm. Zürich 1956.<br />
2차 문헌<br />
에스터 하딩, 김정란 옮김, 사랑의 이해-달 신화와 여성의 신비 , 문학동네, 1996.<br />
이부영, 분석심리학 , 일조각, 1998.<br />
Bächtold-Stäubli, H.: Handwörterbuch des deutschen Aberglaubens. Berlin 1931.<br />
Biehl, Janet: Der soziale Ökofeminismus und andere Aufsätze. Übersetzt. v. Friedericke<br />
Kamann und Wolfgang Haug. Leverkusen 1991.<br />
Birkhäuser-Oeri, Sibylle: Die Mutter im Märchen. Bonz 1993.<br />
Eifler, Margret: Postmoderne Feminisierung. In: Mona Knapp und Gerd Lakroisse(Hrsg.):<br />
Frauen-Fragen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seit 1945. Amsterdam 1989.<br />
Jung, C. G.: Die psychologischen Aspekte des Mutterarchetypen. Zürich 1938.<br />
Jung: Psychologie und Religion. Zürich 1942.<br />
Jung: Aion. Zürich 1951.<br />
Jung: Symbol der Wandlung. Zürich 1952.<br />
Jung: Das Gewissen in psychologischer Sicht. In: Jung, C. G.: Das Gewissen. Zürich 1958.<br />
Harding, M. Esther, Woman's Mysteries: Ancient and Modern, New York 1976(1935).<br />
Franz, Marie-Louise von, The process of individuation, in: Jung, C. G., Man and his<br />
symbols, New York 1964.<br />
Irigaray, Luce, Marine Lover, New York 1991<br />
Irigaray, Elemental Passions, New York 1992.<br />
Rowland, Susan, Jung, A Feminist Revision, Malden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