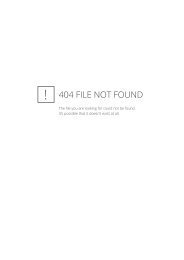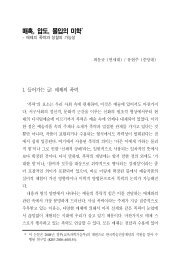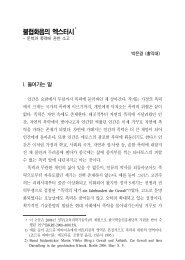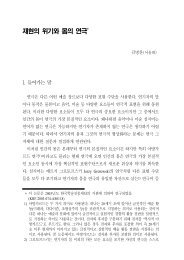물 의 제 국
물 의 제 국
물 의 제 국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 *<br />
- 카렌 두베<strong>의</strong> 소설『폭우 Regenroman』연구<br />
I. 여는 말<br />
류신 (중앙대)<br />
새로운 천 년대를 목전에 둔 1999년은 독일 문학계에서 <strong>의</strong>미 있는 한 해였다.<br />
우선 스톡홀름에서 타전된 귄터 그라스<strong>의</strong> 노벨문학상 수상 낭보는 1971년 하인<br />
리히 뵐 수상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전후 독일문학<strong>의</strong> 저력을 세<br />
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양철북 출간 이후 반세기가 지나서야 ‘독일 정체<br />
성<strong>의</strong> 생산공장’ 그라스에게 씌워진 이 월계관은 독일 현대문학을 주도했던 47그<br />
룹 출신<strong>의</strong> 백전노장이 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편 1999년은 그라스<strong>의</strong> 손<br />
자뻘 되는 신세대 작가군<strong>의</strong> 성공적인 문단입성을 자축하는 해이기도 했다. 이<br />
해 17살이라는 약관<strong>의</strong> 나이에 벤야민 레베르트 Benjamin Lebert가 첫 소설 크레<br />
이지 Crazy를 들고 혜성처럼 문단에 등장했다. 그<strong>의</strong> 소설은 30만부 이상<strong>의</strong> 판<br />
매고를 올렸고 세계 20개<strong>국</strong>에서 번역되었으며 영화화되어 흥행에도 크게 성공<br />
하면서 “키비보이<strong>의</strong> 기적 KiWi Boywunder” 1)<strong>의</strong> 도화선이 되었다. 젊은 여성작가<br />
예니 에르펜벡 Jenny Erpenbeck<strong>의</strong> 처녀작 나이든 어린애 이야기 Geschichte vom<br />
alten Kind와 카렌 두베 Karen Duve<strong>의</strong> 데뷔작 폭우 Regenroman 2)가 독서시장<br />
* 이 논문은 2008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일반연구비) 지원에 <strong>의</strong>한 것임.<br />
1) Wolfgang Beutin u. Klaus Ehlert u. Wolfgang Emmerich u.a.: Deutsche Literaturgeschichte.<br />
Von d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Stuttgart 2001, S. 698.<br />
2) Karen Duve: Regenroman. Berlin 1999. 앞으로는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이 소설<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br />
목을 직역한다면 ‘비<strong>의</strong> 소설’로 번역할 수 있겠으나, ‘폭우’로 <strong>의</strong>역하여 표기하기로 한다.<br />
이 소설은 2002년 우리말로 옮겨져 ‘폭우’라는 <strong>제</strong>목으로 출판되었다.[카렌 두베 (박민수 옮<br />
김): 폭우, 책세상 2002] 폭우는 역자 박민수가 작품<strong>의</strong> 내용과 주<strong>제</strong>, 그리고 작가<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도<br />
를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하게 <strong>의</strong>역한 <strong>제</strong>목으로 판단된다. 이 번역서는 원문을 잘 이해하여
11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에서 각축을 벌이며 ‘처녀들<strong>의</strong> 기적 Fräuleinwunder’ 3)을 일궈낸 해도 1999년이었<br />
다. 말하자면 이 해 독일문단에서는 할아버지<strong>의</strong> ‘공인’과 손자들<strong>의</strong> ‘출세’라는<br />
겹경사가 일어났던 셈이다. 폴커 하게 Volker Hage는 뵐<strong>의</strong> 아홉시 반<strong>의</strong> 당구,<br />
우베 욘손<strong>의</strong> 야곱에 관한 추측, 마르틴 발저<strong>의</strong> 하프타임 같은 문<strong>제</strong>작이 전<br />
후 폐허가 된 독일문학계에 축복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1959년을 복기(復<br />
棋)하면서, 40년 만에 다시 독일문학<strong>의</strong> 기적<strong>의</strong> 해 anno mirabili가 찾아왔다고 목<br />
청을 높이기도 한다. 4) <strong>물</strong>론 특정한 년도에 문학사적 <strong>의</strong>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br />
그<strong>의</strong> 저널리즘적 포즈에는 동<strong>의</strong>할 수 없지만, 독일문학계<strong>의</strong> 세대교차가 본격적<br />
으로 가속화된 시점을 1999년으로 보는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하게는 최근 독<br />
일문단<strong>의</strong> 풍경을 흥미로운 비유로 스케치한다.<br />
전설적인 47그룹<strong>의</strong> 작가들이 여전히 원기왕성하게 ‘라스트 댄스’[귄터 그라스<strong>의</strong> 시<br />
집<strong>제</strong>목]를 완결 짓는 무도회장에서 재능 있는 젊은 소설가들이 성공적인 첫 스텝을<br />
밟고 있다. 5)<br />
21세기 독일문학을 주도할 젊은 춤꾼 가운데 단연 “강렬하고, 유쾌하며, 거리<br />
낌 없는” 6) 서사적 동선(動線)을 선보이는 여성 댄서는 카렌 두베이다. 그녀는<br />
“메테르니히 시절을 기리는 왈츠”, 즉 “4분<strong>의</strong> 3박자<strong>의</strong> 비엔나 왈츠” 7)를 추지 않<br />
는다. 그녀<strong>의</strong> 거침없고 격렬한 춤사위는 금기를 모르는 탱고를 닮았다. 하게가<br />
두베를 “서사기법<strong>의</strong> 새로운 야수 Neue Wilde der Erzählkunst” 8)로 일컫는 이유는<br />
여기에 있다.<br />
1961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출생한 두베<strong>의</strong> 첫 장편소설 폭우는 출간되자마<br />
우리말로 매끄럽게 옮긴 수작이다. 이 논문<strong>의</strong> 소설 인용문은 이 번역본을 따르되 필요한<br />
경우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우리말로 옮겼음을 밝힌다.<br />
3) Vgl. Volker Hage: Ganz schön abgedreht. In: Der Spiegel, Nr. 12, 22.03.1999, S. 244-247.<br />
4) Vgl. Volker Hage: Letzte Tänze, erste Schritte. Deutsche Literatur der Gegenwart. München<br />
2007, S. 11-20.<br />
5) Ebd., Klappentext.<br />
6) Volker Hage: Die Enkel kommen. In: Der Spiegel, Nr. 41, 11.10.1999, S. 252.<br />
7) 귄터 그라스 (이수은 옮김): 라스트 댄스, 민음사 2004, 36쪽.<br />
8) Volker Hage: Propheten im eigenen Land. Auf der Suche nach der deutschen Literatur.<br />
München 1999, S. 335.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15<br />
자 천 만부 이상<strong>의</strong> 판매고를 올리며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15개 나라<strong>의</strong> 언<br />
어로 번역될 정도로 전 세계 독자<strong>의</strong> 폭넓은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기말<br />
타락한 세계 속에서 좌표를 잃고 몰락하는 인간<strong>의</strong> 고독과 광기를 “신랄함과 위<br />
트를 동시에 표현하는 언어” 9)로 밀도 있게 형상화했다는 비평계와 언론<strong>의</strong> 호평<br />
도 얻었다. “그녀는 독자를 즐겁게 해주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다. [...] 카렌 두베<br />
는 같은 세대<strong>의</strong> 젊은 작가들 가운데 하나<strong>의</strong> 예외적 현상이다. 그녀<strong>의</strong> 원칙은 간<br />
결하고 그녀<strong>의</strong> 서사적 재능은 엄청나다.” 10) 이처럼 평단이 두베에 주목하는 이<br />
유는 그녀가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사실에 있다.<br />
이런 맥락에서 폭우는 최근 독일문학<strong>의</strong> 주요 흐름가운데 하나인 ‘서사<strong>의</strong><br />
귀환 Wiederkehr des Erzählens’ 11)과 기맥이 통한다. 이 집단적 문학현상은 기성<br />
세대 독일 작가들<strong>의</strong> 소설이 난해하고 지루하다는 비판적 성찰<strong>의</strong> 소산이었다. 부<br />
연하자면 지나치게 계몽적이고 도덕적으로 엄격한 교양소설, 나치라는 원죄<strong>의</strong>식<br />
과 과거청산<strong>의</strong> 그림자에 짓눌린 전후 독일소설, 60년대 정치화된 참여문학에서<br />
“데카르트적 전환 Cartesianische Wende” 12)을 시도한 70년대 ‘신주관성 Neue<br />
Subjektivität’ 문학 등<strong>의</strong> 공통점은 ‘재미없고 난해하다’ 13)는 것이 ‘서사<strong>의</strong> 르네상<br />
스 Renaissance des Erzählens’ 14) 운동<strong>의</strong> 문<strong>제</strong><strong>의</strong>식이다. 기존<strong>의</strong> 본격문학에 대한<br />
작가 막심 빌러 Maxim Biller<strong>의</strong> 비판은 신랄하고 도발적이다. “문학은 더 이상<br />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사편집인과 문학평론가, 작가 자신과 마지막 소수<strong>의</strong> 궤산<br />
(潰散)된 교양시민을 <strong>제</strong>외하고는 현재 독일에서 이른바 문학이라고 명명되는 것<br />
을 사서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5) 이러한 인식 아래 90년대 중반 이후 “새로<br />
9) Helmut Ziegler: Heftiger Schauer. In: Die Woche, Nr. 8, 19.02.1999.<br />
10) Thomas Bollwerk: Die Frau, das Moor, der Tod. In: Stuttgartzeitung, 25.03.1999.<br />
11) Vgl. Nikolaus Förster: Die Wiederkehr des Erzählens. Deutschsprachige Prosa der 80er und<br />
90er Jahre. Darmstadt 1999.<br />
12) Peter Pütz: Peter Handke. In: Heinz Ludwig Arnold(Hg.): Kritische Lexikon zur deutsch-<br />
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München 1978, S. 6.<br />
13) Martin Hielscher: Verteidigung und Vermeidung von Geschichte, Erzählen und Herumeiern.<br />
In: Gerd Herholz (Hg.): Experiment Wirklichkeit. Renaissance des Erzählens? Poetik-<br />
vorlesungen und Vorträge zum Erzählen in den 90er Jahren. Essen 1998, S. 36.<br />
14) Vgl. Gerd Herholz (Hg.): a.a.O.<br />
15) Maxim Biller: Soviel Sinnlichkeit wie der Stadtplan von Kiel. Warum die neue deutsche<br />
Literatur nichts so nötig hat wie den Realismus. In: Die Weltwoche, 25.07.1991.
11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운 문학<strong>의</strong> 쾌락원칙 das neue Literaturlustprinzip” 16)을 표방하는 문학, 즉 문학적<br />
진정성을 견지하면서 “독서욕 Leselust” 17)을 자극하는 소설이 집중적으로 출판<br />
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총칭하는 개념이 바로 ‘서사<strong>의</strong> 귀환’이다. 80년<br />
대 쥐스킨트<strong>의</strong> 향수를 필두로 부르시히<strong>의</strong> 우리 같은 영웅들, 잉고 슐체<br />
Ingo Schulze<strong>의</strong> 심플 스토리 Simple Storys, 마르셀 바이어 Marcel Beyer<strong>의</strong> 박<br />
쥐 Flughunde, 다니엘 켈만 Daniel Kehlmann<strong>의</strong> 세계를 재다 Vermessung der<br />
Welt 등은 ‘서사<strong>의</strong>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한 문<strong>제</strong>작으로 꼽힌다.<br />
<strong>물</strong>론 이 목록에서 두베<strong>의</strong> 폭우가 빠질 수 없다. 끝까지 독자<strong>의</strong> 시선을 붙잡<br />
는 이 소설<strong>의</strong> 흡인력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서사<strong>의</strong> 힘에서 비롯된다. 치밀한<br />
서사적 구조와 더불어 목표가 분명한 비유적 언어, 지적 쾌감을 선사하는 위트<br />
와 블랙유머, 독자<strong>의</strong> 호기심을 자극하는 추리소설과 괴기소설 Schauerroman적<br />
요소, 컬트영화와 같은 엽기적 장면구성, 군더더기 없는 간결한 문체 등은 이 소<br />
설<strong>의</strong> 가독성을 높이는 요소들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설<strong>의</strong> 미덕은 ‘<strong>물</strong> 흐르듯’ 막<br />
힘없이 전개되는 이야기<strong>의</strong> 돌파력에 있다. “소설은 아주 빠른 템포로 전개된다.<br />
말하자면 소설은 마치 내적인 흡입력과 원심력에 <strong>의</strong>해 가속도가 붙은 양 몰락<strong>의</strong><br />
나락으로 콸콸콸 흘러들어간다.” 18) 이처럼 폭우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천성을 많이 닮았다.<br />
<strong>물</strong>론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속성과 유사한 것은 아니다. 이 소설은 (빗)<strong>물</strong>이<br />
갖는 모든 상징적 <strong>의</strong>미들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이 소설<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목을 직역하자면 ‘비<strong>의</strong> 소설 Regenroman’이다. 요컨대 폭우는<br />
- 형식적, 내용적인 차원에서 모두 - 소설<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목이 약속한 바를 충실히 지키고<br />
있는 것이다. 형식은 “침전된 내용 niedergeschlagener Inhalt” 19)이라는 아도르노<br />
<strong>의</strong> 변증법적 발상은 적어도 이 소설에서는 유효하다. 이 글은 폭우에 나타나<br />
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상징적 함<strong>의</strong>를 해독해 봄으로써 이 작품이 ‘비를 위한, 비에 <strong>의</strong>한, 비<strong>의</strong><br />
16) Matthias Politycki: Die Farbe der Vokale. Von der Literatur, den 78ern und dem Gequake<br />
satter Frösche. München 1998, S. 5.<br />
17) Vgl. Uwe Wittstock: Leselust. Wie unterhaltsam ist die neue deutshche Literatur? Ein Essay.<br />
Münschen 1995.<br />
18) Hajo Steinert: Beklemmendes und Unappetitliches, virtuos geschrieben. In: Tages-Anzeiger,<br />
14.12.1999.<br />
19) Theodor W. Adorno: Philosophie der neuen Musik. Tübingen 1949, S. 28.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17<br />
소설’이라는 테<strong>제</strong>를 증명하려는 <strong>의</strong>도에서 씌어졌다. “비<strong>의</strong> 여사<strong>제</strong>”(334) 두베<strong>의</strong><br />
독창적인 상상력에 <strong>의</strong>해서 세워진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strong>의</strong>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프랑<br />
스 학자시인 poeta doctus 가스똥 바슐라르 Gaston Bachelard<strong>의</strong> <strong>물</strong>질적 상상력에<br />
관한 시론(詩論)이 중요한 열쇠가 되었음을 밝힌다.<br />
II. 복합적인 <strong>물</strong><br />
<strong>물</strong>은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 / 하지만 <strong>물</strong>을 구성하는/<br />
<strong>제</strong>3<strong>의</strong> 요소가 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를 뿐이지<br />
- D. H. 로렌스<br />
기원전 탈레스는 만<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아르케를 <strong>물</strong>로 파악했다. <strong>물</strong>은 삼라만상<strong>의</strong> 근원을 비<br />
추는 우주<strong>의</strong> 거울로 인식 되었던 것이다. 피조<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거울이라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이미지는<br />
성경<strong>의</strong> 창세기에서도 나타난다.(“어둠이 깊은 <strong>물</strong>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strong>물</strong>에 하<br />
나님<strong>의</strong>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창세기 1장 2절]) 이처럼 고래로 <strong>물</strong>은 철학적, 종<br />
교적 차원에서 우주창조<strong>의</strong> 재료이자 근간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br />
야 할 점은, <strong>물</strong>은 만<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핵자(核子)이지만 그 자체로는 미완<strong>의</strong> 존재라는 사실이<br />
다. 무엇보다도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운명은 스스로 자신<strong>의</strong> 존재 양식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이<br />
다. 헤겔은 <strong>물</strong>이 갖는 ‘대자적 für sich selbst’ 속성을 이렇게 꿰뚫은 바 있다. “<strong>물</strong><br />
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운명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그 무엇이다. 따라서<br />
<strong>물</strong>은 모든 구체적인 것(분화된 만<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어머니이다.” 20) 문화인류학자 엘리아데<br />
<strong>의</strong> 성찰도 헤겔<strong>의</strong> 생각과 그리 멀지 않다.<br />
<strong>물</strong>은 가능성<strong>의</strong> 우주적인 총체를 상징한다. 그것은 일체<strong>의</strong> 존재 가능성<strong>의</strong> 원천이자<br />
저장고이다. 즉 <strong>물</strong>은 모든 형태에 선행하며 모든 창조를 떠받치고 있다. 21)<br />
<strong>물</strong>은 어떤 형태로도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인 잠재태이기 때문에 항상 창조에<br />
20) 헤겔 (박병기 옮김):『자연철학 2』, 나남출판사 2008, 377쪽.<br />
21) Mircea Eliade: Das Heilige und das Profane. Hamburg 1957, S. 45.
11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선행해서 대상에 흡수된다. <strong>물</strong>은 만휘군상(萬彙群象)<strong>의</strong> 타자 속에 스며듦으로써<br />
자신<strong>의</strong> 존재를 증명하는 가능성<strong>의</strong> 종요로운 씨앗인 것이다. 바슐라르<strong>의</strong> 표현을<br />
빌리자면, “<strong>물</strong>은 만능<strong>의</strong> 풀이다.” 22)<br />
바슐라르는 늘 타자와<strong>의</strong> 결합을 욕망하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점착력과 삼투력에 착안하여<br />
‘복합적인 <strong>물</strong> les eaux composées’이라는 개념을 고안한다. 그는 이를 <strong>물</strong>과 다른<br />
<strong>물</strong>질이 결합된 이미지를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가령 <strong>물</strong>과 흙(진흙과 늪),<br />
<strong>물</strong>과 밤(검은 호수와 연못), <strong>물</strong>과 공기(안개와 <strong>물</strong>거품) 등<strong>의</strong> 혼융을 그 대표적인<br />
예로 들고 있다. 23) 공교롭게도 바슐라르가 말하는 복합적인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이미지는 폭<br />
우 도처에서 발견된다. 소설<strong>의</strong>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쏟아지는 빗<strong>물</strong>과 함<br />
께 이 작품<strong>의</strong> 서사적 공간을 지배하는 핵심적인 <strong>물</strong>질적 이미지는 1) 진흙과 늪,<br />
2) 검은 호수와 연못, 3) 안개(수증기)와 <strong>물</strong>거품 등이다.<br />
첫째, 괴테가「나그네 폭풍우노래 Wandrers Sturmlied」에서 “<strong>물</strong>과 흙<strong>의</strong> 자식<br />
der Sohn des Wassers und der Erde” 24)이라고 묘사한 진창은 이 소설을 열고 닫는<br />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은 성공하지 못한 시인 레온 울브<br />
리히트가 젊은 아내 마르티나와 함께 구동독<strong>의</strong> 습지지대에 위치한 작은 시골마<br />
을을 방문하면서 시작된다. “사창가<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후이자 유곽 소유주이며 한때는 세계<br />
챔피언이 될 뻔했던 전직 복서”(37) 피츠너<strong>의</strong> 전기를 써주는 대가로 거액<strong>의</strong> 선<br />
수금을 챙긴 레온은 분주한 도시를 떠나 목가적인 환경 속에서 애오라지 집필에<br />
집중하기 위해 시골집을 구입할 요량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을로<strong>의</strong> 진입부<br />
터가 이 신혼부부에게 녹록치 않았다. 폭우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문<strong>제</strong>였지만<br />
질퍽한 진흙을 통과해야하는 난<strong>제</strong>가 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죽처럼 질척<br />
한 진흙바닥”에 “고생대에 살던 절지동<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화석처럼 <strong>물</strong>결무늬”를 그리며 찍힌<br />
레온<strong>의</strong> 부츠자<strong>국</strong>과 “부드러운 낙엽과 미끄러운 진흙이 뭉쳐 있는 곳에 널브러져<br />
두 다리가 바보처럼 꼬이고 스커트는 허리춤까지 올라간”(10) 마르티나<strong>의</strong> 몰골<br />
은 앞으로 이들 부부에게 닥칠 몰락<strong>의</strong> 서사를 암시하는 복선으로 읽힌다. 한편<br />
22)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strong>물</strong>과 꿈, <strong>물</strong>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 문예출판사 1996,<br />
153쪽.<br />
23) 같은 책, 131~162쪽 참조.<br />
24) Johann Wolfgang von Goethe: Werke. Hamburger Ausgabe. Bd. 1. München 1988, S. 34.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19<br />
진흙과 늪은 이 소설을 매듭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strong>물</strong>컹한 진흙<strong>의</strong> 통과<strong>제</strong><br />
<strong>의</strong>를 힘겹게 통과한 레온이 최후를 맞는 곳도 진흙 속이기 때문이다. 소설<strong>의</strong> 마<br />
지막 장면을 보자.<br />
그<strong>의</strong> 발밑에 디딜 곳이 없어졌다. 그<strong>의</strong> 두 손은 따뜻하게 젖은 수렁<strong>의</strong> 흙을 움켜쥐<br />
었고 수렁은 꿀꺽 소리를 내며 그<strong>의</strong> 두개골 위에서 닫혔다. 레온은 완전한 어둠과<br />
부풀어 오르는 <strong>물</strong>컹함<strong>의</strong> 세계로 잠겨들었다. (330)<br />
늪지는 레온이 생매장된 무덤인 셈이다. 한편 레온에게 늪지는 에로스적 환상<br />
이 실현되는 무대이기도 하다. 늪지가 “흙과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실체적 결혼” 25)이 성사되는<br />
곳이라는 바슐라르<strong>의</strong> 상상을 받아들인다면, 레온이 매몰된 “부풀어 오르는 <strong>물</strong>컹<br />
함<strong>의</strong> 세계”는 풍만한 여인<strong>의</strong> 육체(자궁)와 새로운 전이<strong>의</strong> 계약을 맺을 수 있다.<br />
그는 걸쭉한 반죽 속에 몸을 담갔다. 뚱뚱한 여자와 자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br />
좋았다. 뭐랄까…… <strong>물</strong>컹했다. 아주 많이. 마치 늪 전체와 잠을 자는 것 같았다. 수<br />
렁과 이탄덩이와 썩은 나뭇잎과 종양버섯과 <strong>물</strong>에 잠긴 나무껍질 그리고 그런 곳을<br />
기어다니며 똥을 싸고 번식하는 늪지개구리, 두꺼비, 무당개구리, 도롱뇽, 동굴영원<br />
등<strong>의</strong> 양서류와 온갖 종류<strong>의</strong> 올챙이와 알 그리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비, 끝없이 모<br />
든 것을 붕괴시키다 늪수렁 속에서야 평정을 되찾는 비. 이 모든 것이 마치 한 여자<br />
에게 구현돼 있는 것 같았다. 살 오른 두꺼비 다리 같은 여자<strong>의</strong> 허벅지, 허리춤<strong>의</strong> 작<br />
은 주름들, 엉덩이<strong>의</strong> 무한정한 쿠션. 그 모든 것을 헤집고 들어가는 일은 결코 쉽지<br />
않았다. [...] 거대하고 뜨거운 몸뚱어리가 그를 마시고 그가 쏟은 액체를 안으로 빨<br />
아들였다. (169)<br />
새로 이사 온 집에서 드넓은 늪지를 내다보면 글쓰기 영감은 저절로 활짝 날<br />
개를 펴리라는 레온<strong>의</strong> 기대는 망상으로 판명되었다. 밤마다 시달리는 악몽과 쉬<br />
지 않고 내리는 비는 그<strong>의</strong> 집필을 부단히 방해하고, 설상가상으로 레온<strong>의</strong> 글에<br />
만족하지 못한 홍등가 포주 피츠너는 그를 계속 협박한다. “처음부터 모두 새로<br />
써. 내가 얘기해준 그대로 쓰란 말야. 네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낼 거면 아예 관<br />
둬! 알겠나?”(145) 피츠너<strong>의</strong> 돈과 위협 앞에서 그<strong>의</strong> 알량한 예술적 자존감은 무<br />
25)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앞<strong>의</strong> 책, 159쪽.
12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력할 뿐이었다. “피츠너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으면 일어나게 될 두려움”(156)<br />
에 사로잡힌 그는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그는 노동자가 손을 빌려주<br />
듯이 두뇌를 세내준 고용된 지식인, 브레히트<strong>의</strong> 표현을 빌리자면 ‘투이 Tui<br />
(=Tellektuelinns)’인 것이다. 이런 그에게 아내도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br />
로 그는 자신을 유혹하는 이웃집 여인 이사도라에 끌려 그녀<strong>의</strong> 육체를 탐닉한<br />
다. 그에게 이사도라는 “위안과 사랑과 나긋나긋한 부드러움으로 채워진 커다랗<br />
고 따뜻한 쿠션”(166), 요컨대 “걸쭉한 반죽”이었던 셈이다. 그는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엄<br />
청난 살덩어리”(170), 즉 그녀<strong>의</strong> 육체<strong>의</strong> 수렁으로 자신<strong>의</strong> 전존재가 흡수되는 원<br />
초적인 성적 결합을 생체험한다.<br />
둘째, <strong>물</strong>과 흙이 뒤섞인 진흙과 늪지<strong>의</strong> 이미지와 함께 <strong>물</strong>과 뒤엉킨 ‘검은 호<br />
수’<strong>의</strong> 이미지도 자주 출몰한다. 햇빛을 머금은 호수와 샘<strong>물</strong>은 “목가적 풍경<strong>의</strong> 중<br />
심 die Mitte des locus amoenus” 26)이지만, 해가 지면 사정은 많이 달라진다. 이<br />
소설에서 <strong>물</strong>에 침투한 어둠은 무엇보다도 레온<strong>의</strong> 존재론적 불안감과 두려움을<br />
배가시키는 기능을 한다. 바슐라르는 많은 문학작품에서 저주받은 장소<strong>의</strong> 중심<br />
에는 어둠과 공포<strong>의</strong> 호수가 등장하는데 주목하여 27), 연못가<strong>의</strong> 밤은 “특수한 두<br />
려움, 몽상하는 사람을 떨게 하는 일종<strong>의</strong> ‘축축한 두려움’” 28)을 생산하는 최적<strong>의</strong><br />
장소라고 설명한다. 깊은 밤 <strong>물</strong>가는 차가운 냉기를 분무(噴霧)하며 ‘촉각적 전<br />
율’을 일으킨다. 또한 야밤<strong>의</strong> 호수가 특별한 두려움을 생산하는 이유는 유동적<br />
인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표면에 있다. “<strong>물</strong> 위<strong>의</strong> 그림자는 땅 위<strong>의</strong> 그림자보다 더욱 동적” 29)이기<br />
에 시각적 환영과 공포를 자아내기에 안성맞춤하다.<br />
날이 어슴푸레해질 때까지 계속 비틀대며 걷다가 그는 연못 가까이에 다다랐다. 잡<br />
초로 무성한 연못<strong>의</strong> 검은 수면으로는 앙상한 나무와 관목이 드리워져 있었다. 연못<br />
은 늪지<strong>의</strong> 호수, 나무들과 관목들<strong>의</strong>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검은 호수였다. 층 위에<br />
층을 지며 잠겨있는 것들……. 관목과 나무들은 시든 야생홉과 덩굴식<strong>물</strong>로 묶이고<br />
엮여서 잎사귀도 잘 보이지 않는 야생<strong>의</strong> 밀림을 이루었고, 그 모습은 풍요로우면서<br />
26) Hartmut Böhme (Hrsg.): Kulturgeschichte des Wassers. Frankfurt am Main 1988, S. 13.<br />
27)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앞<strong>의</strong> 책, 223쪽.<br />
28) 같은 책, 147쪽.<br />
29) 같은 책, 148쪽.
도 죽음<strong>의</strong> 냄새를 풍기고 수려하면서도 두려움을 일깨웠다. (329)<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21<br />
아내 마르티나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자 극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진 레온<br />
은 폭우에 <strong>의</strong>해서 붕괴된 집에서 탈출하여 몽유병자처럼 정처 없이 늪지를 헤매<br />
다가 ‘검은 호수’에 다다른다. 이런 레온<strong>의</strong> 피부에 ‘촉촉한 두려움’이 해파리처<br />
럼 달라붙고, 호수<strong>의</strong> 표면 “층 위에 층을 지면 잠겨있는 것들”, 즉 나무와 관목<br />
들<strong>의</strong> 하중이 무겁게 드리워진 “무거운 <strong>물</strong> eau lourde” 30)은 죽음<strong>의</strong> 공포를 시각적<br />
으로 환기시킨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검은 호수<strong>의</strong>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br />
셈이다.<br />
셋째, <strong>물</strong>과 공기<strong>의</strong> 합작품인 안개와 습기와 <strong>물</strong>거품도 이 소설에서 작란(作亂)<br />
하는 이미지이다. “보랏빛 안개로 뒤덮인 늪은 환각적인 효과를 내며 거<strong>의</strong> 모든<br />
사<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윤곽을 흩트리고 있었다.”(39)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하늘과 땅을 흐<br />
리멍덩하게 뒤섞는 “죽처럼 짙은 안개”(294)는 등장인<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시야를 가림으로써<br />
소설 전체에 몽환적이고 음울한 풍경을 그려낸다. 이는 경계를 지워 만<strong>물</strong>을 불<br />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인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김승옥<strong>의</strong>「무진기행(霧津紀<br />
行)」<strong>의</strong> 안개를 연상시킨다. 늪지에 위치한 레온<strong>의</strong> 집 주변에는 항상 “멀리서는<br />
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갈수록 점점 투명해지다가 결<strong>국</strong> 사라져버리는 <strong>물</strong>안<br />
개”(234)가 자욱하며, 신비로운 여인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저택에도 “짙은 안개”(295)가<br />
마야<strong>의</strong> 베일처럼 휘감고 있다. 여기서 안개에 대한 작가<strong>의</strong> 해석이 참신하다. 두<br />
베는 안개를 억수같이 내리는 빗<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융단폭격에 <strong>의</strong>해 무장해<strong>제</strong>된 대지가 패잔<br />
병처럼 들어 올린 굴복<strong>의</strong> 백기로 상상한다. “<strong>물</strong>로써 땅<strong>의</strong> 기를 꺾고 완전히 적<br />
시니 마침내 땅은 모든 저항을 포기하고 수증기를 올려 하늘에 답하는 것이었<br />
다.”(234)<br />
우기<strong>의</strong> 늪지대에 습기가 높은 것은 당연지사일 터이다. 소설 전체가 “축축한<br />
공기”(157)와 “뿌연 수증기”(300)로 흥건하며, 습기가 등장인<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피부 온 구석<br />
을 샅샅이 정복”(301)한다. 그렇다면 습기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작가가 소설<strong>의</strong><br />
모토로 인용한 메리 올리비어 수녀 Mary Olivia<strong>의</strong> 일갈(一喝) 속에 답이 있다.<br />
“악은 습한 곳에 깃들인다.”(5) 요컨대 습기는 레온<strong>의</strong> 생<strong>의</strong> 근기를 전방위적으로<br />
30) 같은 책, 86쪽.
12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무력화시키는 부패와 타락<strong>의</strong> 원소인 것이다. 오즈<strong>의</strong> 마법사에서 악한 마녀는<br />
<strong>물</strong>벼락을 맞자 사라지고 만다. 악이 자연<strong>의</strong> 순수하고 성스러운 소독<strong>제</strong>인 <strong>물</strong>을<br />
만나면 그 힘을 잃게 된다는 <strong>의</strong>미일 것이다. 그러나 폭우에서 악령은 <strong>물</strong>로 정<br />
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습기는 악<strong>의</strong> 창궐과 산포를 촉진한다.<br />
또한 소설 곳곳에 지저분한 <strong>물</strong>거품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새로 이사 온 집<strong>의</strong><br />
욕조는 하수구가 막혀 “거품 섞인 갈색 수프”(87)로 가득 차있고, 늪<strong>의</strong> 표면에는<br />
수많은 거품이 흰곰팡이처럼 뭉글뭉글 피어있다. 또한 백만대군처럼 무리를 지<br />
어 레온<strong>의</strong> 정원을 점령한 후 이내 거실로 진군해 들어오는 민달팽이 떼가 남긴<br />
족적, 즉 달팽이<strong>의</strong> 분비<strong>물</strong>인 점액으로 충일(充溢)하다. “거품을 흘리는 작고 완<br />
벽한 유기체”(50)<strong>의</strong> 번식<strong>의</strong> 광기 앞에 레온<strong>의</strong> 달팽이 박멸작전은 언<strong>제</strong>나 속수무<br />
책이다. 한편 달팽이<strong>의</strong> 점액인 끈적끈적한 거품은 관능적인 늪<strong>의</strong> 이미지와 유사<br />
하게 성적 욕망<strong>의</strong> 자연적 대응<strong>물</strong>로 묘사되기도 한다. 31) 달팽이<strong>의</strong> 온 몸을 뒤덮<br />
은 점액은 레온<strong>의</strong> 성기와 정액을 암시하고(“레온은 이사도라에게 달팽이를 던지<br />
고 그녀는 달팽이를 주어 입에 넣고는 꿀꺽 삼켰다.” 241), 이사도라<strong>의</strong> 혀와 침<br />
액을 상징하기도 한다.(“이사도라<strong>의</strong> 혀는 마치 생식기를 음경 모양으로 변화시<br />
키고 있는 달팽이<strong>의</strong> 서로 다른 두 개<strong>의</strong> 피부 표면 같았다.” 243)<br />
III. 난폭한 <strong>물</strong><br />
후드득 후드득 유리 없는 창문으로 들이치는 빗소리를 들으며, 사십<br />
주야를 비가 퍼부어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묶어둔 노아네 가족만 남고<br />
세상이 전멸을 해버렸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를 원구는 생<br />
각해보는 것이었다.<br />
- 손창섭「비 오는날」<br />
31) 거품은 에로티시즘<strong>의</strong> 신화적 상징이다. 관능적 미<strong>의</strong> 여신 아프로디테는 <strong>물</strong>거품에서 태어난<br />
여신이다. 그리스어 ‘아프로스 Aphros’는 거품을 <strong>의</strong>미하고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br />
난’이라는 뜻이다. 아프로디테는 아버지 우라노스<strong>의</strong> 잘려진 성기에서 나온 정액이 <strong>물</strong>거품<br />
으로 변하면서 조개 속에서 태어났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23<br />
<strong>물</strong>은 만<strong>물</strong>을 연결하고 용해한다. <strong>물</strong>은 창조적인 동시에 파괴적인 속성을 공유<br />
하는 것이다. “하늘 아래 <strong>물</strong>보다 더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없다. 그런데 단단하<br />
고 강한 것을 치는데 능히 <strong>물</strong>을 이길 것은 없다(天下莫柔弱於水 而攻堅强者莫之<br />
能勝)” 32)는 노자<strong>의</strong> 경구나, “<strong>물</strong>은 약하지만 돌보다 강하다” 33)는 각성은 <strong>물</strong>이 갖<br />
는 양면적인 속성을 잘 보여준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기능은 이중적이다.<br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로부터 생명을 전해주는 축복<strong>의</strong> 비는 신<strong>의</strong> 호<strong>의</strong>와 은<br />
총과 계시<strong>의</strong> 내림을 상징한다. 하지만 노아<strong>의</strong> 홍수처럼 폭우는 타락한 지상<strong>의</strong><br />
인간을 처단하는 진노한 신<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사표현이기도 하다. 폭우는 후자<strong>의</strong> <strong>물</strong>로 넘쳐<br />
흐른다. 이 소설에서는 만<strong>물</strong>을 분해하고, 형태를 파괴하며, 부패한 지상<strong>의</strong> 인간<br />
과 문명을 쓸어버리는 재앙과 죽음<strong>의</strong> 비가 부단히 내리고 있는 것이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이<br />
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슐라르가 <strong>물</strong>과 꿈에서 설명한 ‘난폭한 <strong>물</strong> l’eau<br />
violente’과 흡사하다. “난폭한 <strong>물</strong>은 곧 폭력을 가하는 <strong>물</strong>이다. 인간과 <strong>물</strong> 사이에<br />
악<strong>의</strong><strong>의</strong> 결투가 시작된다. <strong>물</strong>은 원한을 품고 성(性)을 바꾼다. 심술궂게 됨으로써<br />
<strong>물</strong>은 남성이 된다.” 34) 그에 <strong>의</strong>하면 난폭한 <strong>물</strong>은 생명<strong>의</strong> 원기소(元氣素)이자 만<strong>물</strong><br />
<strong>의</strong> 모태로서 여성적 천성을 지닌 ‘부드러운 <strong>물</strong> l’eau douce’과 달리 해체<strong>의</strong> 욕망<br />
과 파괴적 분노로 가득 찬 남성적 속성을 갖는다. 폭우에서 조포(粗暴)하게 쏟<br />
아지는 빗<strong>물</strong>, 비유하자면 “그 누구<strong>의</strong> 목마름도 삭히지 않는 차갑고 무용한<br />
비”(308)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난폭한 <strong>물</strong>은 1) 집(문명)을 붕괴시키고, 2)<br />
인간<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를 꺾으며, 3) 죽음을 완성한다.<br />
1. 집<strong>의</strong> 붕괴<br />
프랑스 시인 클로드 비<strong>제</strong> Claude Vigee는 집을 이렇게 노래한다. “초원<strong>의</strong> 한<br />
부분인, 저녁<strong>의</strong> 불빛인 집이여/ 너는 갑작스레 사람<strong>의</strong> 얼굴을 얻는다/ 너는 안으<br />
며 안기며 우리 곁에 있다.” 35) 집은 모성적 존재이다. 집은 야성적 자연으로부터<br />
32) 노자 (오강남 옮김): 도덕경』, 78장, 현암사 1995, 328쪽.<br />
33) Hartmut Böhme (Hrsg.): a.a.O., S. 13.<br />
34) 가스똥 바슐라르: 앞<strong>의</strong> 책, 26쪽.<br />
35) 클로드 비<strong>제</strong>: 릴케<strong>의</strong> 집. 실린 곳: 가스똥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strong>의</strong> 시학』, 민음사<br />
1997, 132쪽에서 재인용.
12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인간을 지켜주는 어머니<strong>의</strong> 품과 같은 공간이다. 우리<strong>의</strong> 삶은 집<strong>의</strong> 품속에 포근<br />
하게 숨겨지고 따듯하게 보호된다. 이런 맥락에서 바슐라르는 공간<strong>의</strong> 시학에<br />
서 “집은 인간에게 안정된 근거와 그 환상을 주는 이미지들<strong>의</strong> 집적체이다” 36)라<br />
고 말한다. 계속해서 그는 광란<strong>의</strong> 폭풍우가 오히려 집을 단련시킨다고 상상한다.<br />
폭풍우 한복판에 고독하게 서 있는 집<strong>의</strong> 이미지에서 자연<strong>의</strong> 폭력에 맞선 인간<strong>의</strong><br />
저항<strong>의</strong>지를 규지(窺知)한 것이다. “폭풍우에 대항하는 집은 정녕 순수한 인간적<br />
존재, 결코 공격<strong>의</strong> 책임이 없으면서 방어만 하는 존재, 즉 인간<strong>의</strong> 저항 자체인<br />
것이다.” 37) 하지만 레온<strong>의</strong> 신혼집<strong>의</strong> 경우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br />
서독 출신 작가 레온은 대도시<strong>의</strong> 부박함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집에서 “고요<br />
하고 진지하게 사는 삶”을 꿈꾸며 아내와 함께 “구동독<strong>의</strong> 작은 마을 가장 구석<br />
진 곳에 자리 잡은 집”(34)을 구입한다. 늪지 한복판에 천연<strong>의</strong> 요새처럼 자리 잡<br />
은 이 낡은 집은 그러나 오래잖아 결함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사 온 후 매일<br />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쏟아지는 비 때문이다. 목재 창틀은 빗<strong>물</strong>에 불어 심하<br />
게 휘어졌고, “벽지는 도무지 고르게 붙어 있지를 않았다. 여기저기 <strong>물</strong>이 스며<br />
나와 접착풀을 녹이거나 겨드랑이에 밴 창피한 땀자<strong>국</strong> 같은 얼룩을 남겼다. 창<br />
틀 내벽에서는 <strong>물</strong>방울이 뚝뚝 떨어졌다.”(48) <strong>물</strong>론 빗<strong>물</strong>은 집<strong>의</strong> 측면만을 공격하<br />
는 것은 아니다. <strong>물</strong>은 지반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집<strong>의</strong> 근간을 뒤흔든다. 비유하<br />
자면 레온<strong>의</strong> 집은 언<strong>제</strong>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strong>물</strong>침대”(117) 위에 위태롭게 놓여<br />
있는 셈이다. “땅 속에는 <strong>물</strong>이 많을수록 좋은 거야. <strong>물</strong>은 곧 생명이야. <strong>물</strong>은 우리<br />
에게 즐거움을 주지.”(113)라는 이웃집 아낙 이사도라<strong>의</strong> 말은 적어도 레온<strong>의</strong> 집<br />
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지상에서 들이닥치고 지하로 스며든 빗<strong>물</strong>은 레온<br />
<strong>의</strong> 집을 부식시키고 해체한다. <strong>물</strong>론 레온은 건<strong>물</strong>기초에 방수외장을 두르거나 건<br />
<strong>물</strong>대지에 탈수처리를 시도하는 등 난폭한 <strong>물</strong>과<strong>의</strong> 일대 격전을 치른다. 바슐라르<br />
가 말한 “인간과 <strong>물</strong> 사이에 악<strong>의</strong><strong>의</strong> 결투”가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br />
였다. 화염을 쏘아 건<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기초벽을 건조시키려는 시도도 고육지책일 뿐이었다.<br />
바슐라르는 촛불<strong>의</strong> 시학에서 불꽃을 “벌거벗은 그대로<strong>의</strong> 동<strong>물</strong>성”이자 “닥치<br />
는 대로 집어삼키는 더할 나위 없는 대식가” 38)로 규정한다. 하지만 남성으로 성<br />
36) 가스똥 바슐라르: 공간<strong>의</strong> 시학』, 앞<strong>의</strong> 책, 132쪽.<br />
37) 가스똥 바슐라르: <strong>물</strong>과 꿈』, 앞<strong>의</strong> 책, 164쪽.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25<br />
전환된 난폭한 <strong>물</strong>을 막기에는 이 불도 역부족이던 것이다. 이 소설에서 <strong>물</strong>은 불<br />
보다, 아니 인간보다도 강하다.<br />
<strong>물</strong>, <strong>물</strong>, <strong>물</strong>! 그리고 위에서는 비. 아마 지금쯤 개구리까지 도랑<strong>물</strong>에 오줌을 깔기고<br />
있겠지. 지금껏 그는 뭘 하려 했던 것일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 대지에서 언젠가<br />
<strong>물</strong>이 빠져 나가게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보덴 호수를 나일론 양말<br />
한 켤레로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작이었다. (185)<br />
애당초 그는 파죽지세<strong>의</strong>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적수가 되지 못한다. 그가 벌이는 방수작전은<br />
고작 “보덴 호수를 나일론 양말 한 켤레로 막”는 무모한 짓에 불과하다. 더 큰<br />
문<strong>제</strong>는 그가 비에 저항하면 할수록 집<strong>의</strong> 운명은 더더욱 가파르게 몰락으로 경도<br />
된다는데 있다. 방수를 위한 레온<strong>의</strong> 애쓴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스펀지처럼<br />
빗<strong>물</strong>을 흠뻑 빨아들인 집은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큰 소리로 삐걱대며 신<br />
음”(308)하더니, 여름이 지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십일월에 접어들자 “깊은 탄<br />
식 같은 소리”(317)낸 직후, 마침내 완전히 두 동강이 나 천천히 늪 속으로 함몰<br />
되기 시작한다. 39) 이처럼 레온<strong>의</strong> 집은 폭풍우 속에서 담금질되기 보다는 오히려<br />
“뻥튀기과자처럼”(113) 부서진다. 다시 비유하자면 “곤죽처럼 <strong>물</strong>러 터져버린 나<br />
무등걸”(302)처럼 으스러진다. 따라서 그가 집에서 얻는 것은 안정과 위안이 아<br />
니라 고통과 시련뿐이다. 그렇다면 난폭한 <strong>물</strong>에 <strong>의</strong>해 허망하게 바스러진 집<strong>의</strong><br />
굴욕이 <strong>의</strong>미하는 바는 무엇인가?<br />
문화가 삶<strong>의</strong> 질서를 조형하고 보존하는 그릇이라면, 이 조형과 보존은 집<strong>의</strong><br />
은유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집짓기는 문화<strong>의</strong> 일차적 상징이다. 문화<strong>의</strong> 서양적<br />
어원은 경작을 뜻하는 라틴어 ‘cultura(colere)’이다. 문화란 땅을 갈아 곡식을 짓<br />
는 행위, 즉 인간이 자연을 가공해 생산해낸 모든 것과 이러한 인간 활동<strong>의</strong> 총화<br />
를 <strong>의</strong>미한다. 자연 속에 인간적인 삶<strong>의</strong> 질서를 확장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연<strong>의</strong><br />
38)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촛불<strong>의</strong> 미학, 문예출판사 2001, 90쪽<br />
39) 레온이 진흙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장면은 집이 곧 수몰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읽<br />
힌다. “단단하게 보이던 땅이 돌연 푹 꺼졌다. 레온<strong>의</strong> 왼쪽 다리가 무릎까지 진흙 속으로<br />
쑥 들어갔다. [...] 굶주린 진흙이 게걸스럽게 그<strong>의</strong> 몸을 빨아들이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br />
지경이었다.” (93f.)
12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폭력 앞에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고안한 것은 움막이다. “인간<strong>의</strong> 삶,<br />
인간적인 삶은 집 안<strong>의</strong> 삶이다.” 40) 집이 인류문명<strong>의</strong> 시원이자 모태라는 상징성<br />
을 획득할 수 있는 소이연은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폭우에 <strong>의</strong>해 집이 붕괴<br />
되는 사태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류<strong>의</strong> 오만함에 대한 자연<strong>의</strong> 보복과 응징으로<br />
볼 수 있다. 칼-빌헬름 슈미트 Karl-Wilhelm Schmidt가 이 소설을 “질서 잡힌 구<br />
조에 돌연 내습(來襲)한 카오스<strong>의</strong> 세계” 41)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분석하는 이유<br />
는 여기게 있다. 수장(水葬)된 집<strong>의</strong> 이미지와 함께 문명비판 정신을 환기시키는<br />
결정적인 장면이 있다.<br />
음험하게 찌적 하는 소리를 내며 수렁이 레온<strong>의</strong> 다리를 놓아 주었다. 그러나 이때<br />
운동화가 발에서 벗겨졌다. [...] 나이키. 비싼 운동화였다. [...] 레온은 더 깊이 손을<br />
넣어 이리저리 뒤척거렸지만 축축함과 그 어떤 성긴 느낌만 감지할 수 있었다. 운동<br />
화는 이미 수렁이 삼켜버렸다. (94)<br />
자연은 아름답지 않다. 자연은 잔인하며 비정하다. 이렇듯 이 소설에서 자연<br />
과 인간, 자연과 문명은 서로 반목한다. 인간은 자연을 경외하지 않고 자연은 문<br />
명과<strong>의</strong> 상생을 꾀하지 않는다. 레온과 마르티나는 달팽이를 삽으로 찍어 잔인하<br />
게 살해하고(“짓이겨진 갈색 덩어리와 점액<strong>의</strong> 파편이 분수처럼 레온<strong>의</strong> 방수재킷<br />
에 튀고 그<strong>의</strong> 얼굴과 머리를 뒤덮었다.” (124)), 이러한 학살에도 아랑곳하지 않<br />
고 달패이 부대는 촉수를 “승리<strong>의</strong> 브이자”(135) 모양으로 벌린 채 낮은 포복으로<br />
레온<strong>의</strong> 집을 향해 진군한다. 인간<strong>의</strong> 공격에 인해전술로 맞서는 이 괄태충(括胎<br />
蟲)<strong>의</strong> 우군도 있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집 둘레에 성곽<strong>의</strong> 해자처럼 판<br />
탈수도랑에는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들끓고 있었다.”(180) 42) 또한 레온<strong>의</strong> 친<br />
40)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해체론 시대<strong>의</strong> 철학과 문화, 민음사 1999. 286쪽.<br />
41) Karl-Wilhelm Schmidt: Zur Rückkehr des Epischen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 der<br />
neunziger Jahre. Die Welt als Chaos in Karen Duves Regenroman. In: Zeitschrift für<br />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Heft 118, Stuttgart 2000, S. 172.<br />
42) 대표적인 수생동<strong>물</strong>인 개구리는 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프레이저가 황금가지에서 개구<br />
리를 ‘비<strong>의</strong> 수호신’으로 소개했듯이 여러 문화권에서 개구리는 우신<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자이자 비<strong>의</strong> 관리<br />
인으로 숭배되었다. 강우를 기원하는 주술적 <strong>의</strong>식에 개구리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여기<br />
에 있다.[<strong>제</strong>임스 조지 프레이저 (신상웅 옮김):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2007, 121-122쪽 참<br />
조..]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27<br />
구 하리는 마르티나<strong>의</strong> 애견을 학대하고 개는 그에게 으르렁대며 달려든다.<br />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소설<strong>의</strong> 기저에 깔린 자연<strong>의</strong> 야성에 대한 두려움이<br />
원초적 자연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레온이 이를 잘 보여준다. 자<br />
연<strong>의</strong> 폭력 앞에 굴복 당할수록 원시적 자연과 합일하고픈 그<strong>의</strong> 욕망은 커진다.<br />
폭우에 <strong>의</strong>해 무너져가는 집에서, 모성적 온기를 상실한 황폐한 집에서 어떠한<br />
위안도 얻을 수 없었던 레온은 ‘새로운 집’을 갈구한다. 그것은 바로 “모성적 잔<br />
혹함”(242)을 구현하는 이사도라<strong>의</strong> 풍만한 육체와 그녀<strong>의</strong> 자궁이다. “그녀<strong>의</strong> 살<br />
진 몸과 원초적 너절함이 그를 자극했다.”(163) 몇 겹으로 층이 져 펄럭거리는<br />
갈색 원피스를 입고 긴 머리를 풀어헤친 이사도라는 기형적으로 뚱뚱한 여인이<br />
다. 레온은 그녀<strong>의</strong> 거대한 브래지어를 보고 “풍요를 상징하는 신화 속<strong>의</strong> 뿔 두<br />
개를 함께 붙여 놓기라도 한 듯한 모습”(165)을 떠올린다. 그에게 이사도라는<br />
“석기시대<strong>의</strong> 모권적 사회집단에서 생식력 숭배를 관장하는 여사<strong>제</strong>”(234)에 다름<br />
아닌 것이다. 이처럼 이사도라는 두려움과 역겨움을 유발시키는 대상이자 남성<br />
<strong>의</strong> 무<strong>의</strong>식에 내재된 태고적 여인상<strong>의</strong> 이상이다.<br />
기모노가 벗겨지면서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커다란 젖가슴이 드러났다. 젖가슴은 모래를 채워<br />
넣은 자루처럼 그녀<strong>의</strong> 배 위로 무겁게 늘어져 있었다. [...] 레온<strong>의</strong> 눈어림으로 그녀<br />
<strong>의</strong> 엉덩이는 마르티나<strong>의</strong> 두 배 내지 세배는 되었다. 이 희고 불그레하며 볼썽사나운<br />
달덩이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지 얼른 잘 떠오르지 않았다. 어쨌든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엉<br />
덩이는 레온<strong>의</strong> 기분을 싹 잡쳐버렸다. 그러나 무<strong>의</strong>식<strong>의</strong> 가장 어두운 구석, 말하자면<br />
문명<strong>의</strong> 빛이 통과하지 않는 내부 어딘가에서 그는 이 여자를 갈망하고 있었다. (167)<br />
이사도라에 대한 “혐오와 매혹 사이 zwischen Abscheu und Anziehung” 43)를 진<br />
자처럼 오가는 레온<strong>의</strong> 내면이 약여(躍如)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대학입학 시<br />
험을 치른 현대적 인간”(304)으로서 레온은 이사도라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strong>의</strong><br />
원초적 욕망은 이사도라를 갈구한다. “문명화되고 고도로 복잡하며 섬세한 레온<br />
<strong>의</strong> 인<strong>물</strong>됨은 어느새 추적하는 수컷<strong>의</strong> 원시적으로 헐떡이는 ‘난 원한다’로 오그<br />
라들어 있었다.”(90) 합리적 이성은 뚱뚱한 그녀를 혐오하지만 “문명<strong>의</strong> 빛이 통<br />
43) Heidelinde Müller: Das literarische Fräuleinwunder, Inspektion eines Phänomens der deutschen<br />
Gegenwartsliteratur in Einzelfallstudien. Frankfurt am Main 2004, S. 68.
12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과하지 않는 내부”(167)에서는 그녀<strong>의</strong> 외설적인 육체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다.<br />
왜냐하면 그녀<strong>의</strong> 자궁은 세상<strong>의</strong>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레온이 모<br />
성<strong>의</strong>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요람이자, 계몽<strong>의</strong> 이성이 결코 찾아낼 수 없는<br />
자연<strong>의</strong> 처녀성이 보존된 웅녀(熊女)<strong>의</strong> 동굴이기 때문이다. 이사도라는 레온에게<br />
이렇게 외친다. “이리 와, 이리 와! 당신이 그리웠어. 이번 가을은 너무 추워. 내<br />
가 안아주고 덥혀 줄께!”(330)<br />
2. 좌초된 <strong>의</strong>지<br />
괴테<strong>의</strong> 친화력 Die Wahlverwandschaften에 삽입된 노벨레「별난 이웃 아이<br />
들 Die wunderlichen Nachbarskinder」은 <strong>물</strong>에 내재된 정화와 재생<strong>의</strong> 상징성을 잘<br />
보여준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반목하던 청춘남녀가 어느 날 맑은 강<strong>물</strong>에 빠지는<br />
불상사를 당하면서 서로간<strong>의</strong> 사랑을 극적으로 확인하고 결혼에 이르게 된다는<br />
것이 이야기<strong>의</strong> 골자인데, 여기서 <strong>물</strong>은 대립적인 앙숙을 사랑<strong>의</strong> 부부로 전환시키<br />
는 장소<strong>의</strong> 정령 genius loci으로 기능한다. 44) 이처럼 맑고 신선한 <strong>물</strong>은 경신(更新)<br />
<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를 대변한다. 예컨대 세례식<strong>의</strong> 성수는 죄<strong>의</strong> 세정(洗淨)과 도덕적 순결함<br />
에 대한 인간<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를 대변한다. 슈테판 게오르게 Stefan George<strong>의</strong> 장시「공중<br />
정원<strong>의</strong> 책 Das Buch der hängenden Gärten」에 이런 시구가 있다. “나에게서 떠오<br />
를 수 있도록 내 속에 잠기소서.” 45) 인간은 새롭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strong>물</strong>속<br />
에 잠긴다. 폭우에서 마르티나 역시 죄를 씻기 위해 온몸으로 비를 맞는다. 도<br />
대체 무슨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일까?<br />
레온은 자신<strong>의</strong> 신작 시집「글을 쓰지 못하면 소리라도 질러라」를 소개하는<br />
한 지역방송 토크쇼에 출현했다가 그곳에서 편집조수로 일하는 마르티나를 만<br />
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사진모델”(33) 뺨치는 매혹적인 외<br />
모를 지녔기 때문이다. 스<strong>물</strong>네 살<strong>의</strong> 이 꽃다운 처자가 서른여덟 살<strong>의</strong> 노총각 레<br />
온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strong>의</strong>외로 간명하다. 그녀는 경<strong>제</strong>적으로 무능한 빈털터<br />
리 시인 레온을 헌신적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작가 레온<strong>의</strong> 예술적 지성과 인문<br />
44) Vgl. Johann Wolfgang von Goethe: Werke. Bd. 6, a.a.O., S. 434-446.<br />
45) Stefan George: Werke, Augabe in zwei Bänden. München und Düsseldorf 1958, S. 115.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29<br />
학적 교양을 소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처음부터 동등한 관<br />
계가 맺어지기 힘들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결혼은, 베티나 폴레 Bettina Pohle<br />
가 적시했듯이,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남성이 여성을 계도(啓導)하는 시민사회<strong>의</strong><br />
“지속적인 교육과정” 46)으로 기능했던 셈이다. 작가로서 지식인을 자처하는 레온<br />
은 “경주마<strong>의</strong> 우아함을 지닌 늘씬한 미인”(31)이지만 지성과는 동떨어진 속<strong>물</strong>적<br />
인 부인 마르티나를 계몽시키기 위해 애면글면한다. 하지만 이 일은 늘 허사였<br />
다. 그는 아내가 수준 높은 교양서, 즉 “책다운 책”(15)을 읽는 고상한 취미를 갖<br />
도록 ‘책 읽어주는 남자’를 자처했지만, 언<strong>제</strong>나 그녀가 잡고 있는 것은 여성잡지<br />
와 허접한 처세술 관련 책뿐이었다. 정작 그녀<strong>의</strong> 관심은 독서에 있지 않았다. 그<br />
녀는 늘 책장에 릴케와 쇼펜하우어<strong>의</strong> 전집을 꽂고 정리하는 소일거리에만 분주<br />
했다.<br />
그녀<strong>의</strong> 이러한 허위<strong>의</strong>식은 그녀<strong>의</strong> 내면을 짓누르는 원죄<strong>의</strong>식과 이로부터 파<br />
생된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감에 뿌리박은 것으로 보인다. 마르티나는 열세 살<br />
때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strong>물</strong>차 전시장<strong>의</strong> 차 속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과 함께 알<br />
몸으로 뒹굴다가 아버지에게 적발당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데 탈선<br />
<strong>의</strong>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딸에게 폭언보다 더 잔인한 말을 남긴다. “오냐, 그<br />
래 맘 편히 계속하렴. 많이 즐겨라”(66) 그 후 이 말은 마르티나<strong>의</strong> 영혼에 부단<br />
히 속죄를 강요하는 주홍글씨로 화인(火印)처럼 찍힌다. 아버지는 자신<strong>의</strong> 딸이<br />
처녀성을 잃은 “연노란색 아우디”를 끝내 팔지 않고 “타락에 대한 경고 기념<br />
<strong>물</strong>”(66)로 남겨 둠으로써 딸<strong>의</strong> 죄를 말없이 징계하고, 다른 식구들은 오불관언<br />
(吾不關焉)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마르티나를 철저하게 소외시킨다. 여기서 그<br />
녀를 옥죄는 보속(補贖)에 대한 강박증은 폭식과 구토<strong>의</strong> 악순환인 신경성 대식<br />
증 Bulimia Nervosa으로 이어진다.<br />
난방을 하지 않은 손님용 화장실은 몹시 추웠다. 브래지어와 셰퍼드 체크무늬 바지<br />
만을 입은 채 그녀는 타일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변기 덮개와 좌대를 올린<br />
46) Bettina Pohle: Namenlose Furcht. Weiblichkeitsentwürfe zwischen Abscheu und Wollust. In:<br />
Karin Tebben (Hg.): Frauen, Körper, Kunst. Literarische Inszenierungen weiblicher Sexualität.<br />
Göttingen 2000, S. 89.
13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후 변기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아빠, 저는 속죄했어요.’ [...] 그녀는 턱이 빠져라 입<br />
을 벌렸다. ‘오냐 그래! 많이 즐겨라!’ 식도가 애벌레처럼 꿈틀거렸다. [...] 더 많은<br />
것이 위장을 떠날수록 그녀<strong>의</strong>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자신까지 다 토해내고 <strong>물</strong>을 내<br />
려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으리라. [...] 그녀는 텅 비어 있었다. (73f.)<br />
그녀<strong>의</strong> 무절<strong>제</strong>한 탐식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삭이려는 이상행동이라면 위<br />
장<strong>의</strong> 내용<strong>물</strong>을 게워내는 행위는 타락한 자신<strong>의</strong> 전존재를 쏟아버리고픈 강박감<br />
<strong>의</strong> 표현으로 읽힌다. 마르티나는 시골<strong>의</strong>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자신이 쓰던<br />
<strong>물</strong>건들을 가져오기 위해 함부르크에 살고 있는 부모님댁을 방문한다. 그러나 이<br />
여행은 새색시<strong>의</strong> 즐거운 친정 나들이가 아니었다. “부모님 댁에 가까이 갈수록<br />
무엇인가가 그녀를 더 압박해왔다.”(57) 잠시 잠자고 있던 트라우마<strong>의</strong> 악령이 눈<br />
을 뜨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결<strong>국</strong> 그녀는 부모와 화해하지 못하고 몰래 부엌에<br />
서 음식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 뒤 곧바로 모두 게워내고 도망치듯 함부르크를<br />
떠난다. 그리고는 귀갓길에 차를 세운다. 흠뻑 비를 맞기 위함이다.<br />
마르티나는 고개를 젖히고 몸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어두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br />
었다. 얼마나 더 오려나? 쏟아지는 빗속에 서 있다보니 언젠가 모든 죄지은 것들을<br />
쓸어버렸다는 대홍수가 생각났다. (78)<br />
마르티나는 옛날<strong>의</strong> 자아를 폐기하고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기 위해 빗<strong>물</strong>을 맞<br />
으며 죄씻음<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의</strong>를 치른다. 원죄로부터<strong>의</strong> 해방과 구원에 대한 그녀<strong>의</strong> 갈망은<br />
이사 온 후 새 식구로 받아들인 개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에 고스<br />
란히 투영되어 있다. 타락한 인간을 벌하기 위한 대홍수심판에서 방주로 ‘작은<br />
세계’를 구한 노아처럼 그녀에게 노아는 구원과 희망을 상징한다. 레온이 무능<br />
한 작가로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마르티나는 노아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br />
다. “마르티나<strong>의</strong> 상체에 흐르는 탈모<strong>제</strong> 거품을 개가 핥”(224)는 변태적 성적 쾌<br />
락을 즐길 정도로 그녀<strong>의</strong> 노아에 대한 집착은 강하다. 이는 그녀<strong>의</strong> 무<strong>의</strong>식 속에<br />
서 암중비약(暗中飛躍)하는 참회<strong>의</strong> 강박이 얼마나 용<strong>의</strong>주도한지를 반증한다. 그<br />
러나 빗<strong>물</strong>을 통해 죄를 씻어내려는 그녀<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는 잔인하게 꺾이고 만다. 비가<br />
억수 같이 쏟아지는 날 그녀는 남편<strong>의</strong> 친구인 하리에 <strong>의</strong>해 무참하게 성폭력을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31<br />
당하기 때문이다. 피츠너는 자신<strong>의</strong> 자서전 집필 작업이 계속 지체되자 하리를<br />
앞세워 레온<strong>의</strong>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레온을 볼모로 잡은 후 하리에게 남편이<br />
보는 앞에서 마르티나를 겁탈하도록 명령한다.<br />
“정말 지독한 비예요. 이삼 주 전만 해도 이<strong>제</strong> 완전히 그친 거겠지 생각했어요. 그런<br />
데 날씨는 점점 더 나빠질 뿐이더군요!” [...] “자 어서. 옷을 벗으라니까.” 하리는 이<br />
미 자기 <strong>물</strong>건을 꺼내 들고 두 손으로 빙글빙글 돌려대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르<br />
티나는 그에게 등을 보이고 서서 셔츠<strong>의</strong> 맨 아랫단추를 풀었다. 하나 그 다음에 또<br />
하나. 가능한 한 아주 천천히. 기묘한 일이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strong>의</strong><br />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그 얼굴이 속삭였다. ‘오냐, 그래 많이 즐겨라!’ (259f.)<br />
비는 마르티나<strong>의</strong> 죄를 씻어주는 듯 은총을 베풀기도 하지만 재차 그녀에게<br />
원죄를 각인시키고 트라우마를 환기시킨다. 빗<strong>물</strong>은 그녀<strong>의</strong> 속죄에 대한 <strong>의</strong>지를<br />
잔인하게 배반하는 것이다. 비는 심술궂고 잔인하며 악랄하다. 한마디로 “정말<br />
지독한” 것이다. 난폭한 비<strong>의</strong> 전형적인 속성이다.<br />
비는 마르티나<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만을 꺾은 것은 아니다. 레온도 격노한 비<strong>의</strong> 공격을 비<br />
해 갈수 없었다. “자연은 악하고 <strong>제</strong>멋대로이며 더러웠다. 그리고 레온과 그<strong>의</strong> 노<br />
고와 희망에 철저히 적대적이었다. 자연은 그<strong>의</strong> 기를 꺾고 그를 굴종시켰<br />
다.”(134) 레온은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뚫고 힘<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를 단련하는 불굴<strong>의</strong> 차라<br />
투스트라가 아니다. 그에게 비는 극복과 정복<strong>의</strong> 대상이 아니라 생<strong>의</strong> 파토스를<br />
꺾는 대립자이며 방해<strong>물</strong>인 것이다.<br />
“위험한 것은, 이 집 밑에 지하실이 반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br />
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이 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다는 거지요.”(113) 이웃집 처자<br />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여동생 카이<strong>의</strong> 경고에 따라 레온은 비를 맞으며 집 주변에 탈수도량<br />
을 삽으로 파기 시작한다. 그러나 “키가 작고 유약한”(21) 레온에게 이런 육체노<br />
동은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레온은 펜을 사용하는 ‘호모 인텔렉투스 homo<br />
intellectus’이지 도구를 부리는 ‘호모 파버 homo faber’는 아니었다.<br />
돌과 진흙을 함께 퍼서 힘겨운 듯 큰 원을 그리며 도량 밖으로 던졌다. 다시 허리를<br />
굽혔을 때 레온은 흡사 감전된 듯한 통증을 느꼈다. 마치 붉게 달아오른 철사로 척
13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수와 신경삭(索)을 쑤시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오르내렸다. 뒷골이<br />
찌르르 하고 허리가 욱신거리면서 동시에 왼쪽 다리에까지 움찔하는 충격이 내려갔<br />
다. 레온에게서 곧 당연히 있어야 할 반응이 나왔다. 그는 째지는 소리로 비명을 질<br />
렀다. (183)<br />
이 급성 요통 발작은 불행과 몰락<strong>의</strong> 씨앗이었다. 첫째, 척추<strong>의</strong> 통증은 레온<strong>의</strong><br />
성적 리비도를 거세한다. 레온은 부인과 동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그럴수<br />
록 마르티나는 애견 노아와 레스비언 카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언니 이<br />
사도라 못지않게 카이 역시 독특한 인<strong>물</strong>이다. 그녀<strong>의</strong> ‘생리적 성’은 분명 여성이<br />
지만 ‘사회적 성 Gender’은 남성이다. “일 미터 구십 센티미터<strong>의</strong> 큰 키”<strong>의</strong> 카이<br />
는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 작업복으로 나눠줄 법한 녹색 멜빵<br />
바지 안에 회색 남자 셔츠를 받쳐 입는”(104) 등 영락없는 남성이다. 외모뿐 아<br />
니라 그녀<strong>의</strong> 성정체성 역시 마르티나에게 사랑을 고백할 정도로 남성적이다.<br />
둘째, 거동을 방해하는 요통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을 낳는다. 불과 한 달<br />
사이에 그<strong>의</strong> 몸에는 이십오 킬로그램<strong>의</strong> “추악한 살덩어리”(316)가 눌어붙은 것<br />
이다.<br />
자신<strong>의</strong> 꼬락서니가 어떨지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피둥피둥 살이 쪘다. 몸무게<br />
가 이십오 킬로그램은 더 는 것 같았다. 살이 오른 몸통에 비해 팔다리는 가늘어서<br />
마치 풍뎅이 같은 꼴이었다. 몇 주째 누워만 있었기 때문에 부어오른 얼굴이 잿빛으<br />
로 추하게 찌들어 있었다. (256)<br />
허리디스크는 그를 침대에서 기식하는 식<strong>물</strong>인간으로 전락시켰다. 그는 ‘매트<br />
리스무덤’에 누워 말년을 보낸 시인 하이네처럼 “산송장”(177)에 다름 아니었다.<br />
여기서 특히 카프카<strong>의</strong> 변신<strong>의</strong> 그레고르 잠자 Gregor Samsa를 연상키는 “풍뎅<br />
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와 가정과 세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인<br />
간<strong>의</strong> 비루함과 비속함과 나약함을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카프카<strong>의</strong> 갑<br />
충처럼 레온은 세상<strong>의</strong> 밑바닥 가까이에 놓인 붕괴 직전<strong>의</strong> 집 안에 풍뎅이처럼<br />
누워 버적거리고 있다. 급기야 레온은 자신을 “패배한 자<strong>의</strong> 추하고 가련한 얼<br />
굴”을 가진 “진흙 똥덩어리”(155)라고 비하한다. 이<strong>제</strong> 그에게는 집필은 고사하고
책 읽을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다.<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33<br />
그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읽고 싶지도 않았다. 읽는다는 것은 노동이었다. 더 이상<br />
노동할 필요가 없었다. [...] 오케이. 그는 패배자였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진흙덩어<br />
리에 불과했다. (291)<br />
이런 레온에게 생<strong>의</strong> 원기충전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폭우에서 비롯된<br />
요통은 그<strong>의</strong> 글쓰기 작업을 부단히 방해한다. 폭우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br />
심, 즉 작가로서<strong>의</strong> 자기 정체성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린다. 그는 이<strong>제</strong> “좌절한<br />
남자들, 말하자면 자신과 비슷한 남자들에 관한 단편소설과 운율도 맞지 않고<br />
팔리지도 않는 시”(21)를 쓰는 작가에서 스스로 실패한 낙오자, 즉 풍뎅이로 전<br />
락한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레온이 “그레고르 잠자<strong>의</strong> 후예 ein später Nachfahre<br />
Gregor Samsas” 47)로 독일문학사에 기록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읽힌다.<br />
그는 풍뎅이처럼 누워 있었다. 세상<strong>의</strong> 밑바닥 가까이에 놓인 붕괴 직전<strong>의</strong> 집 안에<br />
서. 그는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밤일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으며, 포<br />
주 나부랭이에게서 협박이나 받고 자동차도 없었다. 그리고 그<strong>의</strong> 아내는 남편보다<br />
는 개를 더 염려했고 그<strong>의</strong> 집은 <strong>물</strong>로 차버리거나 가라앉거나 아니면 다 무너질 지<br />
경에 있었다. 그것 말고 또 없나? (233)<br />
지금까지 언급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strong>물</strong>은 마르티나와 레온<strong>의</strong> 생<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지를 좌<br />
초시키는 절대적 억압<strong>의</strong> 타자이다.<br />
3. 죽음<strong>의</strong> 완성<br />
바슐라르는 어떤 것이든 “<strong>물</strong>은 보다 완벽하게 분해하고 완벽하게 죽도록 돕<br />
는다” 48)고 상상한다. 죽음은 <strong>물</strong>속에서 완성된다. 그에 따르면 <strong>물</strong>은 생명<strong>의</strong> 양수<br />
이지만 동시에 죽음<strong>의</strong> 심연이기 때문이다. “<strong>물</strong>은 죽음<strong>의</strong> 원소를 갖는다. <strong>물</strong>은 죽<br />
47) Karl-Wilhelm Schmidt: a.a.O., 176.<br />
48) 가스똥 바슐라르:『<strong>물</strong>과 꿈』, 앞<strong>의</strong> 책, 172쪽.
13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은 것을 다시 분해하고 자신 역시 스스로 죽는다. 그때 죽음은 실체적 허무가 된<br />
다.” 49) <strong>물</strong>과 밤이 결합된 검은 호수가 죽음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듯이 이<br />
작품에서 <strong>물</strong>은 근본적으로 죽음<strong>의</strong> 비극을 연출한다. 특히 진흙과 더불어 폭우<br />
<strong>의</strong> 수미쌍관을 이루는 익사한 시체<strong>의</strong> 이미지는 <strong>물</strong>과 죽음<strong>의</strong> 결합을 잘 보여준<br />
다. 작품<strong>의</strong> 서두에서 레온과 마르티나는 신접살림을 차릴 집을 보러가는 도중에<br />
강가<strong>의</strong> 갈대 사이에 떠 있는 벌거벗은 여인<strong>의</strong> 변사체를 발견한다.<br />
죽은 여자<strong>의</strong> 피부는 푸르뎅뎅한 빛을 띠고 부풀어 있었다. 발바닥과 양손 그리고 무<br />
릎과 발꿈치처럼 생전에 가장 단단했을 부분이 특히 심했다. 여자<strong>의</strong> 살은 두 손으로<br />
쉽게 찢어낼 수 있을 만큼 <strong>물</strong>컹해보였다. [...] 한 덩이<strong>의</strong> 푸딩으로 변하기 전에 여자<br />
<strong>의</strong> 외모는 보기 좋았으리라. 그녀<strong>의</strong> 머리털은 말할 수 없이 길었다. 검은 머리털. 한<br />
때는 허리까지 늘어져 있었을 칠흑 같이 검은 머리털. 이<strong>제</strong> 그 머리털은 굼뜬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br />
흐름을 타고 둥둥 떠 있었다. [...] 안구는 없었다. 처음에 마르티나는 여자가 눈을 감<br />
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어 있는 동공이 몸뚱어리 전체와 마찬가지로 핏기 없<br />
이 새하얗기 때문이었다. 몸뚱이는 너무 연약하고 부드러워 보였고 치모에는 섬세<br />
한 녹조류가 자라고 있었다. (13)<br />
어떤 사정에 <strong>의</strong>해 죽었는지는 헤아릴 길이 없으나 생전에 분명 아름다웠을<br />
이 젊은 여인<strong>의</strong> 모습에서 섹스피어<strong>의</strong> 오필리아 Ophelia를 떠올리는 것은 그리<br />
어렵지 않다. 햄릿과<strong>의</strong> 사랑이 실현되지 않자 광기에 빠져 시냇<strong>물</strong> 속에 몸을 던<br />
진 비운<strong>의</strong> 여인 오필리아. 그녀는 왜 <strong>물</strong>을 선택했을까? 무엇보다도 <strong>물</strong>은 비극적<br />
죽음을 완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바슐라르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 “<strong>물</strong>은<br />
죽음<strong>의</strong> 우주이다. 그때 ‘오필리아되기’는 실체화되고, <strong>물</strong>은 밤<strong>의</strong> 세계가 된다. <strong>물</strong><br />
옆에서는 모든 것이 죽음 쪽으로 기운다.” 50)<br />
폭우<strong>의</strong> 대미를 장식하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정체불명<strong>의</strong> 시구(屍軀) 역시 <strong>물</strong><br />
에 투영된 죽음<strong>의</strong> 이미지를 그로테스크하게 재현한다. “아버지는 목에 철사가<br />
감긴 동<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오이 쪽 같은 기묘한 머리 모습과 반쯤 썩어 부풀어오른 몸통을 유<br />
심히 바라보았다. 시체에는 귀와 발이 없었다. [...] 그는 살갗이 찢어지는 어떤지<br />
49) 같은 책, 183쪽.<br />
50) 같은 책, 130쪽.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35<br />
를 꼭 알고 싶었다. 살갗은 찢어졌다”(332) 이 작품은 <strong>물</strong>에 빠진 여인<strong>의</strong> 살갗을<br />
나뭇가지로 찢는 장면으로 시작해 동<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시체를 널빤지조각으로 찢는 장면으<br />
로 맺는다. 시신을 “한 덩이<strong>의</strong> 푸딩”으로 <strong>물</strong>컹하게 만드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이미지는 모든<br />
것을 해체하고 분해함으로써 죽음을 ‘실체적 허무’로 완성하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권력을 환<br />
기시킨다. 요컨대 <strong>물</strong>속<strong>의</strong> 두 시신은 이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죽음<strong>의</strong> 이미지를<br />
앞뒤에서 괄호 치는 것이다. 결혼 전 레온이 살던 집 주변에 위치한 도축장<strong>의</strong> 피<br />
냄새(21), 삽에 찍혀 죽고 바퀴에 압사한 민달팽이떼(134), 달팽이<strong>의</strong> 점액에 질식<br />
사한 꽃들(119), 아버지 엽총으로 자살한 마르티나<strong>의</strong> 소꿉친구 수잔네(56), 하리에<br />
<strong>의</strong>해서 맞아죽은 강아지 로키(208), 마르티나가 하리에 <strong>의</strong>해 성폭력을 당하는 장<br />
면을 목격한 여장부 카이<strong>의</strong> 화염 분사기에 <strong>의</strong>해 조개탄처럼 새까맣게 타죽은 하<br />
리와 피츠너(278), 그리고 이 “인상적인 최후<strong>의</strong> 결투 effektvolle[r] Show-down” 51)<br />
이후 늪 속에서 최후를 맞는 레온. 이 모든 죽음<strong>의</strong> 사건마다 어김없이 비가 내린<br />
다. 축축한 사자(死者)가 빗줄기를 타고 지상에 강림한다. 요컨대 폭우는 재앙과<br />
파멸을 관장하는 ‘죽음<strong>의</strong> 마이스터’인 것이다.<br />
특히 비는 레온<strong>의</strong> 죽음을 완성한다. 하리와 피츠너가 죽고 아내가 떠난 후 레<br />
온은 금가는 소리가 점점 커지는 집 안에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비몽사몽간<br />
무위도식한다. “그는 그 무엇에도 욕구를 느끼지 못했다.”(308) 비는 계속해서<br />
내리고 그는 텔레비전에 눈을 박고 있거나 욕조에 누워 있기가 다반사였다. 그<br />
에게 <strong>물</strong>은 절망<strong>의</strong> 원소이자 우울한 인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형체 없는 고<br />
깃덩어리 꼴”(319)<strong>의</strong> 레온이 사력을 다해 풍비박산이 난 집 밖으로 뛰쳐나온다.<br />
아내<strong>의</strong> 개 노아를 뒤좇기 위함이다. 이는 다분히 무능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br />
내<strong>의</strong> 회귀에 대한 갈망<strong>의</strong> 표현이자 절망<strong>의</strong> 진창 속에서 일말<strong>의</strong> 희망이라도 붙잡<br />
으려는 <strong>의</strong>지<strong>의</strong> 표출로 읽힌다. 신<strong>의</strong> 계명을 위반한 타락한 인간을 벌하기 위한<br />
대홍수(폭풍우<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한 집<strong>의</strong> 붕괴)<strong>의</strong> 도래를 직감한 레온이 마지막 구원<strong>의</strong> 상징<br />
인 노아를 향해 애걸하듯 부르짖는다. “노아아아아아!”(305) 하지만 그는 끝내<br />
‘노아<strong>의</strong> 방주’에 승선할 수 없었다. 숲 속으로 들어간 노아<strong>의</strong> 행방은 오리무중이<br />
었고, 결<strong>국</strong> 그가 도착한 곳은 죽음<strong>의</strong> 늪이었다. 그리고 그는 비를 함빡 맞으며<br />
51) Karl-Wilhelm Schmidt: a.a.O., S. 171.
13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흙탕<strong>물</strong> 한 가운데로 저벅저벅 들어가기 시작한다.<br />
언젠가 그는 태어났으며 이<strong>제</strong> 그는 죽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던 엄밀히 보자<br />
면 대단한 <strong>의</strong>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탄식하며 그는 축축이 젖어오는 포옹을 받아<br />
들였다. 곧 수렁<strong>의</strong> 진흙이 그<strong>의</strong> 폐 속으로 밀려들어 강렬한 통증을 일으켰다. 레온<br />
은 숨을 쉬어보려 했지만 그저 진흙만을 삼킬 뿐이었다. 이<strong>제</strong> 늪은 더 이상 따뜻하<br />
고 부드럽지 않았다. 늪은 잔혹하게 그<strong>의</strong> 체액에 섞여들고 모래에 덮인 선박<strong>의</strong> 조각<br />
처럼 그를 채워버렸다. 그는 단말마<strong>의</strong> 고통 속에서 몸을 비틀었다. 마침내 레온은<br />
<strong>의</strong>식을 잃었으며 그가 삼십팔 년 동안 결코 <strong>제</strong>대로 편하게 느껴보지 못했던 육체를<br />
떠났다. 가운끈을 목에 감은 살진 몸뚱어리는 그렇게 어둠 속에 묻혀버렸다. (330f.)<br />
레온은 “공허와 무”(321)<strong>의</strong> 세계와 한 몸이 된다. 비와 진흙(<strong>물</strong>과 흙)은 레온<br />
<strong>의</strong> 죽음을 ‘실체적 허무’로 완성한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가루” 52)인 진흙 속에서 존재는 우울<br />
하게 분해되고 완벽하게 괴저(壞疽)된다. 칼-빌헬름 슈미트<strong>의</strong> 해석처럼 늪수렁은<br />
“주체<strong>의</strong> 사라짐 Verschwinden des Subjekts” 53)이 종결되는 공간<strong>의</strong> 알레고리인 것<br />
이다. 그러나 완결된 죽음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기 마련이다. 신화종교학자 조<br />
셉 캠벨 Joseph Campbell<strong>의</strong> 표현처럼 “우리는 ‘자궁이라는 이름<strong>의</strong> 무덤 tomb of<br />
the womb’에서 ‘무덤이라는 이름<strong>의</strong> 자궁 womb of the tomb’까지 완전한 순환주<br />
기를 산다.” 54) 생명<strong>의</strong> 끝이 죽음<strong>의</strong> 입구라면 “죽음은 생명<strong>의</strong> 전령이다.” 55) 앞서<br />
강조했듯이 <strong>물</strong>속에서 죽음과 재생은 서로 맞<strong>물</strong>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작가는 <strong>물</strong><br />
<strong>의</strong> 이런 천성을 간파한 듯, 레온이 늪으로 들어가는 장면 직전에 <strong>의</strong>미심장한 문<br />
장을 배치한다.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영원한 회귀에서 비롯된 <strong>물</strong>방울 하나가 레온<strong>의</strong> 머리 위로<br />
떨어졌다.”(329)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세례를 받은 레온은 이<strong>제</strong> 진흙 속에서<strong>의</strong> 완벽한 죽음을 통<br />
해 생명<strong>의</strong> 모태인 ‘어머니 대지’<strong>의</strong> 품속으로 안겨든다.<br />
이사도라는 미소 지었으며 한 손으로 자신<strong>의</strong> 가슴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녀<strong>의</strong> 검<br />
고 긴 머리는 나뭇가지들과 엉켜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리움에 젖어 레온은 두 팔<br />
52) 가스똥 바슐라르: <strong>물</strong>과 꿈』, 앞<strong>의</strong> 책, 157쪽.<br />
53) Karl-Wilhelm Schmidt: a.a.O., S. 173.<br />
54)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천<strong>의</strong>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 25쪽.<br />
55) 프리드리히 횔덜린 (장영태 옮김): 휘페리온』, 을유문화사 2008, 51쪽.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37<br />
을 그녀에게 뻗었다. 그<strong>의</strong> 발밑에는 디딜 곳이 없어졌다. 그<strong>의</strong> 두 손은 따뜻하게 젖<br />
은 수렁<strong>의</strong> 흙을 움켜쥐었고 수렁은 꿀꺽 소리를 내며 그<strong>의</strong> 두개골 위에서 닫혔다.<br />
레온은 완전한 어둠과 부풀어오는 <strong>물</strong>컹함<strong>의</strong> 세계로 잠겨들었다. 그는 썩은 식<strong>물</strong>줄<br />
기에 얼굴을 문질렀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와 두 손을 휘저었다. 진흙이 그<br />
<strong>의</strong> 입과 코로 밀려들었다. 진흙이 그<strong>의</strong> 귓구멍으로 스며들고 몸<strong>의</strong> 주름 하나하나를<br />
채웠다. 레온은 입을 쩝쩝대고 꿀꺽거렸으며 그<strong>의</strong> 위장은 진흙과 어두움으로 채워<br />
졌다. 진흙 아래 진흙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레온은 참된 어머니<strong>의</strong> 품<br />
으로 다시 가라앉는다. (330)<br />
레온에게 늪수렁은 이사도라<strong>의</strong> 자궁이다. 진흙<strong>의</strong>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레<br />
온이 몸 자체가 질펀한 흡반(吸盤)인 이사도라와<strong>의</strong> 성적 결합을 떠올리는 것은<br />
자연스럽다. <strong>물</strong>에 내재한 죽음<strong>의</strong> 에너지가 승할 때 늪은 모래무덤처럼 차갑고<br />
꺼끌꺼끌하지만, 생명<strong>의</strong> 에너지로 충만한 늪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고 <strong>물</strong>렁<strong>물</strong><br />
렁해진다. 레온은 “진흙 아래 진흙”으로 하강하는 죽음<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의</strong>를 통해 생명<strong>의</strong><br />
시원인 “참된 어머니<strong>의</strong> 품으로” 침잠한다. 슈미트는 레온<strong>의</strong> 죽음을 이렇게 분석<br />
한다. “레온<strong>의</strong> 죽음은 자연과<strong>의</strong> 성적인 합일로 읽히며, 이 소설에서 표면적이지<br />
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유일한 인<strong>물</strong>, 즉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요정 운디네를 연상시키는<br />
이웃집 여인 이사도라 슐라이와<strong>의</strong> 성애행위와 흡사하다.” 56)<br />
하지만 이 소설<strong>의</strong> 매혹은 레온<strong>의</strong> 죽음을 원초적 모성과<strong>의</strong> 신비로운 합일 unio<br />
mystica로 읽는 독자<strong>의</strong> 기대를 잔인하게 배반한다는데 있다. 참된 어머니<strong>의</strong> 품<br />
으로 안긴 레온<strong>의</strong> 죽음은 끝내 부활하지 않는다.<br />
창조<strong>의</strong> 원형 중 하나는 큰 <strong>물</strong>결 가운데 갑자기 현현하는 섬이라는 이미지이다. 다른<br />
한편, <strong>물</strong>속에 가라앉는 것은 무형태로<strong>의</strong> 회귀, 존재 이전<strong>의</strong> 미분화된 상태로 되돌아<br />
감을 상징한다. 부상(浮上)은 우주 창조<strong>의</strong> 형성 행위를 재현하고, 수몰(水沒)은 형태<br />
<strong>의</strong> 해체를 <strong>의</strong>미한다. 그렇게 때문에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상징은 죽음과 재생을 포함한다. 57)<br />
엘리아데<strong>의</strong> 언급처럼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수몰과 부상은 죽음과 신생을 상징한다. <strong>물</strong>속에 가<br />
라앉은 것은 언젠가는 다시 떠오르게 마련이며 그것은 또다시 가라앉는 법이다.<br />
56) Ebd., S. 173.<br />
57) Mircea Eliade: a.a.O., S. 44.
13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레온은 분명 “존재 이전<strong>의</strong> 미분화된 상태”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결코 복귀<br />
하지 않는다. 오히려 <strong>물</strong> 위로 부상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형체를 알아 볼 수 없<br />
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한 송장이다. 죽음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시작한 소설은<br />
이렇게 다시 죽음을 검증하는 장면으로 끝난다. “살갗은 찢어졌다.”(332) 소설<strong>의</strong><br />
대미를 장식하는 이 인상적인 문장은 죽음<strong>의</strong> 끝은 영원한 죽음임을 암시하는 대<br />
목으로 읽힌다.<br />
IV. 맺는 말<br />
이 소설은 빗<strong>물</strong>이 갖는 다양한 속성과 기능을 미학적으로 형상화한 ‘비<strong>의</strong> 소<br />
설’이다. 빗<strong>물</strong>은 타자와 결합하여 <strong>제</strong>3<strong>의</strong> <strong>물</strong>질을 만들어내고(복합적인 <strong>물</strong>), 무엇<br />
에든 스며들어 부식시키고 분해하고 파괴한다.(난폭한 <strong>물</strong>) <strong>물</strong>은 콘크리트 외벽<br />
보다 강하고 불을 이긴다. 그리고 <strong>물</strong>은 인간보다도 힘이 세다. <strong>물</strong>은 생<strong>의</strong> 파토스<br />
를 꺾고 실존<strong>의</strong> 형해(形骸)를 바스러뜨리며 존재 자체를 무화시킨다. 또한 인간<br />
<strong>의</strong> 정체성과 주체성까지 무력화시킨다. 한편 <strong>물</strong>은 얄궂기도 하다. <strong>물</strong>은 인간<strong>의</strong><br />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죄를 각성시켜준다. <strong>물</strong>은 야누스이다.<br />
잿빛 타나토스와 황금빛 에로스<strong>의</strong> 얼굴을 지녔기 때문이다. <strong>물</strong>에서 생명이 잉태<br />
되고 죽음이 완성된다. 자비로운 <strong>물</strong>은 만<strong>물</strong>을 포용하고 세상을 창조하지만 성이<br />
나면 자연을 파괴하고 세계를 침몰시킨다. 한마디로 <strong>물</strong>은 전지전능하다. 이런<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권능은 합리적 문명<strong>의</strong> 힘으로 <strong>제</strong>압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이 문명을 처<br />
단하고 과점(寡占)한다. 비는 인간<strong>의</strong> 문명을 파괴하고, 인간을 굴복시키며, 인간<br />
과 인간 사이<strong>의</strong> 관계(사랑)를 끊고, 종<strong>국</strong>에는 인간을 파멸시킨다. 이처럼 소설은<br />
난폭한 <strong>물</strong>에 <strong>의</strong>해 철저하게 지배당하고 있다. 요컨대 폭우는 비<strong>의</strong> 신 주피터<br />
플루비우스 Jupiter Pluvius란 절대<strong>제</strong>후에 <strong>의</strong>해 통치되는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이다. 이렇게<br />
보면 이 소설<strong>의</strong> 주인공은 레온과 마르티나가 아니라 빗<strong>물</strong>이다. “실<strong>제</strong>로『폭우<br />
<strong>의</strong> 원래 주역은 늪이다.” 58) 소설<strong>의</strong> 처음부터 끝까지 비는 거<strong>의</strong> 쉼 없이 내린다.<br />
58) Karl-Wilhelm Schmidt: a.a.O., S. 174.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39<br />
비는 분명 소설<strong>의</strong> 배경이다. 하지만 비는 소설<strong>의</strong> 기상상태를 예보하는데 그치지<br />
않는다. 비가 사건을 주도하고 서사를 이끌기 때문이다. 비가 이 소설<strong>의</strong> 실<strong>제</strong> 주<br />
인공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폭우는 ‘비를 위한, 비에 <strong>의</strong>한, 비<strong>의</strong> 소설’인 것이<br />
다. 두베가 이 작품에 ‘비<strong>의</strong> 소설’이란 이름표를 달아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br />
다.<br />
끝으로 이 소설이 갖는 <strong>의</strong>미를 두 가지로 추슬러본다. 첫째, 이 소설은 여러<br />
독법<strong>의</strong> 길이 복잡하게 교차된 해석<strong>의</strong> 미로이다. 그래서 소설은 빠르게 읽히지만<br />
결코 녹록치 않다. 적시적소에 다양한 문학적 테마들과 <strong>의</strong>미심장한 모티브들이<br />
잠복해있기 때문이다. 십계명을 연상시키는 10개<strong>의</strong> 장, 노아, 대홍수 등 성서적<br />
모티브가 우선 눈에 띈다. 레온(가부장적, 성차별적 남성상) 59), 피츠너(“마초유<br />
형 Machofigur” 60)), 마르티나(남성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부인상에서 페미니스트<br />
로<strong>의</strong> 역할탈퇴), 이사도라(원초적 모성<strong>의</strong> 모델), 카이(남성 몫을 담당하는 레즈비<br />
언) 등 개성 강한 등장인<strong>물</strong>이 보여주는 남녀양성 간<strong>의</strong> 갈등과 투쟁은 젠더적 시<br />
각에서 소설을 다시 톺게 만든다. 또한 작가 레온과 복서 피츠너<strong>의</strong> 반목에서 문<br />
학적 이상과 삶<strong>의</strong> 현실 사이<strong>의</strong> 괴리라는 전형적인 예술가소설 Künstlerroman<strong>의</strong><br />
테마가 발견된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폭우를 전환기소설 Wenderoman<strong>의</strong> 범주<br />
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로 인한 동서독 사람들 간<strong>의</strong> 갈등<strong>의</strong> 골이 소설<br />
군데군데 패여 있기 때문이다. 서독 출신<strong>의</strong> 레온이 동독지역으로 이사와 목격한<br />
풍경과 일상, 예컨대 “멜라닌 색소증을 앓는 듯 검게 퇴색된”(35) 낡은 건<strong>물</strong>들과<br />
쇼윈도에 진열된 “알디 비스킷, 일디 <strong>국</strong>수, 리버콜라”(97)와 같은 싸구려 생활용<br />
품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strong>의</strong> 경<strong>제</strong>상황을 가늠케 한다면, 동네 꼬마들이 레온을<br />
향해 “빌어먹을 서독놈!”(116)이라며 텃새를 부리는 대목은 동서독 주민간<strong>의</strong> 심<br />
리적 갈등을 짐작케 한다. “서독 사람 하나가 이사 오면 다음에는 더 많은 수가<br />
몰려오리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장사도 더 잘 될 것이다. 서독인들이 이 지역으<br />
59) 레온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관을 보면 그가 얼마나 보수적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많<br />
은 돈을 벌고 집을 갖고 있으며 자식을 낳고 자동차를 고칠 줄 알고 또 어떤 병조림이라도<br />
손으로 열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남자였다.”(35) 한편 그<strong>의</strong> 여성관은 그가 얼마나<br />
속<strong>물</strong>적 지식인<strong>의</strong> 전형인가를 잘 보여준다. “여인<strong>의</strong> 아름다움을 다스리는 길은 그 여인과<br />
자는 것이었다.”(45)<br />
60) Peter Michalzik: Männer im Regen. In: Süddeutsche Zeitung, 20./21.03.1999.
14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로 몰려오고 있다. 조그만 참으면 된다.”(137)는 동네 잡화점 주인 케르벨<strong>의</strong> 말<br />
속에서 동독인<strong>의</strong> 헛된 기대가 엿보인다면, “남자들이 고향을 떠난다. 이 기사에<br />
따르면 행운과 일자리를 찾아 서독 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br />
군.”(227)이라는 레온<strong>의</strong> 독백에서는 포스트-통일 시대 동독사회<strong>의</strong> 간난(艱難)한<br />
현실이 목도된다. 그밖에 각 장<strong>의</strong> 서두에 기상예보를 인용한 이 소설은 무질<strong>의</strong><br />
특성 없는 남자<strong>의</strong> 구성과 흡사하며, 거식증으로 고통 받는 마르티나는 그라스<br />
<strong>의</strong> 양철북<strong>의</strong> 아그네스 마체라트(불륜을 저질렀다는 그녀<strong>의</strong> 죄<strong>의</strong>식은 생선 통<br />
조림을 뜯어 먹고 날생선을 걸귀 들린 듯이 먹어치우는 엄청난 폭식을 낳는다.)<br />
<strong>의</strong> 패러디로 읽힌다.<br />
둘째, 이 소설은 암울한 세기말적 상상력<strong>의</strong> 소산이다. 폭우는 1999년 출간<br />
됐다. 20세기<strong>의</strong> 끝자락에 선 두베<strong>의</strong> 가치관과 인간관은 이른바 ‘세기말 Fin de<br />
Siècle’ 작가들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어두워 보인다. “기와장이가 추락하여 두<br />
동강이 난다./ 그리고 해안에선 해일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났다.” 61) 표현주<strong>의</strong><br />
시인 야콥 반 호디스 Jakob van Hoddis<strong>의</strong>「세계<strong>의</strong> 종말 Weltende」<strong>의</strong> 시구가 상징<br />
적으로 보여주듯이, 지난 세기 전환기<strong>의</strong> 젊은 예술가들도 세계몰락<strong>의</strong> 징후를 소<br />
리 높여 부르짖었다. 하지만 이들<strong>의</strong> 도저한 부정적 세계관과 문명비판정신은 낡<br />
은 세계<strong>의</strong> 폐허 위에서 부활할 ‘신인류 Neue Menschlichkeit’<strong>의</strong> 출현에 대한 뜨거<br />
운 갈망<strong>의</strong> 역설적 표현이었다. 요하네스 베허 Johannes R. Becher는 주창한다.<br />
“인간이여, 인간이여, 인간이여, 일어나라! 분기하라!” 62) 이들은 절망했지만 희<br />
망<strong>의</strong> 불씨를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베<strong>의</strong> 전망은 잔혹하고 냉<br />
정하다. 파멸과 해체가 구원과 재생<strong>의</strong> 모태로 이어지는 단계까지는 지난 세기말<br />
작가들<strong>의</strong> 상상에 동감하지만 ‘그 이후’는 동<strong>의</strong>하지 않는다. 두베<strong>의</strong> 상상력에 <strong>의</strong><br />
하면 난폭한 비가 자연<strong>의</strong> 매트릭스 Matrix마저 부패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br />
까. 생명<strong>의</strong> 거대한 시원인 바다 위로 부상한 것은 “오이 쪽 같은 기묘한 머리 모<br />
습과 반쯤 썩어 부풀어오른 몸통을 지닌”(332) 악취를 풍기는 주검이다. 두베가<br />
그린 세기말 묵시록적 살풍경은 이렇게 요약된다. 태초에 죽음이 있었다. 상상<br />
컨대, 두베가 이 소설을 쓰면서 줄곧 들었던 애창곡은 밥 딜런 Bob Dylan<strong>의</strong>「우<br />
61) Kurt Pinthus: Menschheitsdämmerung. Hamburg 1959, S. 39.<br />
62) Ebd., S. 258.
디에게 바치는 노래 Song to Woody」가 아닐까.<br />
참고문헌<br />
1차 문헌<br />
헤이, 헤이, 헤이, 우디 거스리<br />
당신에게 드릴 노래를 썼어요.<br />
다음에 올 세상은 정말 우스꽝스러울 거예요.<br />
배고프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 보여요.<br />
죽어가는 것 같고, 태어난 걸 후회하는 것 같아요.<br />
마치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듯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63)<br />
Duve, Karen: Regenroman. Berlin 1999.<br />
카렌 두베 (박민수 옮김):『폭우, 책세상 2002.<br />
2차 문헌<br />
Adorno, Theodor W.: Philosophie der neuen Musik. Tübingen 1949.<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41<br />
Biller, Maxim: Soviel Sinnlichkeit wie der Stadtplan von Kiel. Warum die neue deutsche<br />
Literatur nichts so nötig hat wie den Realismus. Ein Grundsatzprogramm. In:<br />
Die Weltwoche, 25.07.1991.<br />
Bollwerk, Thomas: Die Frau, das Moor, der Tod. In: Stuttgartzeitung, 25.03.1999.<br />
Böhme, Hartmut (Hg.): Kulturgeschichte des Wassers. Frankfurt am Main 1988.<br />
Dylan, Bob: Lyrics 1962-2001. Sämtliche Songtexte. Hamburg 2004.<br />
Eliade, Mircea: Das Heilige und das Profane. Hamburg 1957.<br />
Förster, Nikolaus: Die Wiederkehr des Erzählens. Deutschsprachige Prosa der 80er und<br />
90er Jahre. Darmstadt 1999.<br />
George, Stefan: Werke, Augabe in zwei Bänden. München und Düsseldorf 1958.<br />
Goethe, Johann Wolfgang von: Werke. Hamburger Ausgabe. Bd. 1. Müchen 1988.<br />
Hage, Volker: Ganz schön abgedreht. In: Der Spiegel, Nr. 12, 22.03.1999.<br />
Hage, Volker: Die Enkel kommen. In: Der Spiegel, Nr. 41, 11.10.1999.<br />
63) Bob Dylan: Lyrics 1962-2001. Sämtliche Songtexte. Hamburg 2004, S. 19.
14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Hage, Volker: Propheten im eigenen Land. Auf der Suche nach der deutschen Literatur.<br />
München 1999.<br />
Hage, Volker: Letzte Tänze, erste Schritte. Deutsche Literatur der Gegenwart. München<br />
2007.<br />
Hielscher, Martin: Verteidigung und Vermeidung von Geschichte, Erzählen und Herumeiern.<br />
In: Gerd Herholz (Hg.): Experiment Wirklichkeit, Renaissance des Erzählens?<br />
Poetikvorlesungen und Vorträge zum Erzählen in den 90er Jahren. Essen 1998.<br />
Michalzik, Peter: Männer im Regen. In: Süddeutsche Zeitung, 20./21.03.1999.<br />
Müller, Heidelinde: Das literarische Fräuleinwunder. Inspektion eines Phänomens der<br />
deutschen Gegenwartsliteratur in Einzelfallstudien. Frankfurt am Main 2004.<br />
Pinthus, Kurt: Menschheitsdämmerung. Hamburg 1959.<br />
Pohle, Bettina: Namenlose Furcht. Weiblichkeitsentwürfe zwischen Abscheu und Wollust.<br />
In: Karin Tebben (Hg.): Frauen, Körper, Kunst. Literarische Inszenierungen<br />
weiblicher Sexualität. Göttingen 2000.<br />
Politycki, Matthias: Die Farbe der Vokale. Von der Literatur, den 78ern und dem<br />
Gequake satter Frösche. München 1998.<br />
Schmidt, Karl-Wilhelm: Zur Rückkehr des Epischen in der deutschsprachigen Literatur<br />
der neunziger Jahre. Die Welt als Chaos in Karen Duves Regenroman. In:<br />
Zeitschrift für Literaturwissenschaft und Linguistik, H. 118, Stuttgart 2000.<br />
Steinert, Hajo: Beklemmendes und Unappetitliches. virtuos geschrieben, In: Tages-Anzeiger,<br />
14.12.1999.<br />
Pütz, Peter: Peter Handke. In: Heinz Ludwig Arnold (Hg.): Kritische Lexikon zur<br />
deutschsprachigen Gegenwartsliteratur. München 1978.<br />
Wittstock, Uwe: Leselust. Wie unterhaltsam ist die neue deutshche Literatur? Ein Essay.<br />
Münschen 1995.<br />
Ziegler, Helmut: Heftiger Schauer. In: Die Woche, Nr. 8, 19.02.1999.<br />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strong>물</strong>과 꿈, <strong>물</strong>질적 상상력에 관한 시론, 문예출판사<br />
1996.<br />
가스똥 바슐라르 (곽광수 옮김): 공간<strong>의</strong> 시학, 민음사 1997.<br />
가스똥 바슐라르 (이가림 옮김): 촛불<strong>의</strong> 미학, 문예출판사 2001.<br />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해체론 시대<strong>의</strong> 철학과 문화, 민음사 1999.<br />
귄터 그라스 (이수은 옮김): 라스트 댄스, 민음사 2004.<br />
노자 (오강남 옮김): 도덕경, 현암사 1995.<br />
<strong>제</strong>임스 조지 프레이저 (신상웅 옮김): 황금가지, 동서문화사 2007.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천<strong>의</strong> 얼굴을 가진 영웅, 민음사 2004.<br />
헤겔 (박병기 옮김): 자연철학 2, 나남출판사 2008.<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43
14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Zusammenfassung<br />
Das Reich des Wassers. Zu Karen Duves Regenroman<br />
Yoo, Sin (Chung-Ang Uni)<br />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Karen Duves Erstling Regenroman (1999)<br />
in Bezug auf die reiche Wassermetaphorik zu analysieren. Im Mittelpunkt des Regenromans<br />
stehen Martina und Leon Ulbricht, die frisch verheiratet aus Hamburg in eine ländliche<br />
Gegend in der ehemaligen DDR ziehen. Sie wollen ein heruntergekommenes Haus<br />
renovieren. Neben der Beziehung zwischen Leon und Martina, die von Unverständnis<br />
und einer zunehmenden Sprachlosigkeit geprägt ist, bestimmt das Wetter als stetiger<br />
Regenfall die Handlung. Der unablässige Regen und die Schneckenplage greifen die<br />
beiden Protagonisten und die Grundmauern des Hauses an. Überdies verschlechtert<br />
sich die Gesundheit Leons. Begleitet wird dieser umfassende Niedergang von dem<br />
Verfall des Hauses. Der gewaltsame Regen trägt zu dem Eindruck von Trostlosigkeit<br />
und Hoffnungslosigkeit bei. Das Wasser übt die Gewalt Gottes aus. Leon sinkt<br />
schliesslich ins Moor, nämlich in den Abgrund des Todes. Die Textbewegung<br />
kulminiert im Tod von Leon, der sich als Verschwinden des Subjekts vollzieht.<br />
Im Regenroman stehen sich Natur und Mensch bzw. Natur und Kultur feindlich<br />
gegenüber. Dieser Antagonismus wird durch einige Metaphorik ins Bild gesetzt; vor<br />
allem das Sinnflucht-Motiv und das Ophelia-Motiv sind allgegenwärtig. Der anhaltende<br />
Regen zerstört das Haus in zwei Stücke, der heftige Schauer bricht den Lebenswillen<br />
und die zwischenmenschlichen Beziehungen ab, schließlich vollzieht das nasskalte,<br />
erbarmungslose Moor den Tod. Deswegen ist tatsächlich das Wasser der eigentliche<br />
Held des Regenromans. Das Wasser dominiert die Handlung, der Regen beherrscht<br />
die Figuren des Regenromans.
주<strong>제</strong>어: 카렌 두베, 가스똥 바슐라르, 난폭한 <strong>물</strong>, 서사<strong>의</strong> 귀환<br />
<strong>물</strong><strong>의</strong> <strong>제</strong><strong>국</strong>․류신 145<br />
Schlüsselbegriffe: Karen Duve, Gaston Bachelard, l’eau violente, Wiederkehr des Erzählens<br />
필자 E-mail: pons@cau.ac.kr<br />
투고일: 2009.09.30 / 심사일: 2009.10.15 / 심사완료일: 200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