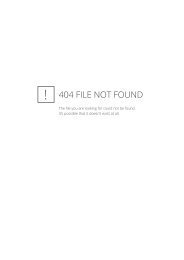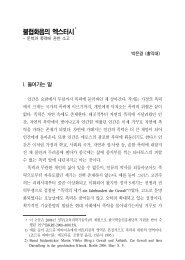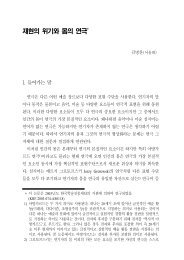매혹, 압도, 몰입의 미학 - 한국뷔히너학회
매혹, 압도, 몰입의 미학 - 한국뷔히너학회
매혹, 압도, 몰입의 미학 - 한국뷔히너학회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 * 1)<br />
- 매체의 폭력과 성찰의 가능성<br />
I. 들어가는 글: 매체의 폭력<br />
최문규 (연세대) / 유현주 (중앙대)<br />
‘폭력’의 요소는 우리 사회 속에 편재하며, 이것은 예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br />
다. 서구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근간을 이루는 신화의 원초적 형상에서부터 현<br />
대의 디지털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력은 예술 속에 언제나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br />
한 점은 예술작품 속의 주제나 소재가 폭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br />
뿐만 아니라, 작품이 표현되거나 수용되는 형식에서도 폭력성이 발휘된다는 점<br />
에서 쉽게 입증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폭력의 의미는 ‘다른 이에게 가하는 물리<br />
적 힘’이나 그로 인한 ‘신체적 상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차적인 뜻에서<br />
보다 확장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폭력의 개념에는 앞서 말한 정의 외에도 ‘거<br />
대한 힘’이나,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위력적으로 행사되는 강제성’이라는 좀<br />
더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바로 이렇게 확장된 틀에서 예술작품의<br />
심미적 체험이 가진 영향력이나 <strong>미학</strong>적 방법론으로서 폭력의 논의가 가능해진<br />
다.<br />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나타나는 예술의 폭력적 힘은 이를 전달하는 매체와의<br />
관련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폭력이라는 주제가 지금 집중적으로<br />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매체에 의해서 마치 실제와 같은 폭력이 눈앞에<br />
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매체 스<br />
스로가 행사하고 있는 폭력도 언급할 수 있다. 모든 매체는 전달과 수용에 있어<br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br />
행된 연구임 (KRF-2008-A00155).
35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서 자신만의 방식을 관철시키며, 특히 사회의 주도매체가 전환되는 시점에서는<br />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매체형식으로 정보를 인지하고 교환하도록 강제하는 폭<br />
력성도 나타난다. 1) 벤야민이 고찰한 대로, 폭력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그 시<br />
스템을 공고히 하는 ‘법 제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br />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폭력도 존재하는데, 2) 이러한 종류의 폭력은 정체되어 있<br />
는 시스템을 교란하고 혼돈에 빠뜨림으로 해서 역설적으로 창발적 진화의 계기<br />
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적인<br />
측면에서 폭력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분석보다는, 매체 자체가 위력적<br />
인 힘을 수용자에게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매체는<br />
인지방식에 따라 대상에 대한 몰입과 거리를 통한 성찰이라는 이중적인 기능을<br />
가지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매체<strong>미학</strong>이 가지고 있는 법 제정적이며 동시에<br />
법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견하게 된다.<br />
매체연구에 있어서 시스템을 제정하는 폭력과 시스템을 파괴하는 폭력의 양<br />
가성은 고대 그리스의 메두사 신화를 연상시킨다. 아름다운 소녀였으나 신의 저<br />
주를 받아 뱀으로 변한 머리카락을 가진 메두사는 마주보는 사람들을 돌로 변하<br />
게 하는 괴물이다. 이러한 신화적 형상은 현대 매체의 양면적 특성과 관련된다.<br />
점차 발전해가는 기술공학적 수단으로 매체예술은 대부분의 경우 ‘<strong>매혹</strong>’적이고<br />
‘<strong>압도</strong>’적인 다른 세계로의 ‘몰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러한 매체예술의 수<br />
용자는 메두사의 눈과 마주한 것처럼 감각의 향연을 위해 성찰의 기회를 제물로<br />
바친다. 매체를 사용하고 향유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동의해야 하는 강제적인 형<br />
식이 있으며, 매체가 발달할수록 그 정도는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br />
점은 이러한 배경에서 아비투스화 되어있는 매체환경을 순간적으로, 그러나 위<br />
력적으로 균열시키는 것이 바로 매체예술이 수행하는 또 하나의 <strong>미학</strong>적 전략이<br />
라는 것이다. 메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영웅의 청동거울처럼 이러한 전략은<br />
대상과 수용자 사이의 거리를 복구해 내는데 주력한다.<br />
1)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초반 ‘문자화’의 시대에 모든 것을 문서화시키려 했던 열기나, 근래<br />
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br />
다.<br />
2) 발터 벤야민: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이성원 역, 실린 곳: 자율평론 2호(2002.12.28), 36쪽.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55<br />
부연하자면, 신화 속 영웅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베기 위해서 사용했던<br />
것은 자신의 방패, 즉 깨끗하게 닦은 청동거울이었다. 여기에 반영된 상을 통해<br />
그는 메두사의 눈빛 속에 빠져들지 않고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임무를 완수<br />
할 수 있었다. 눈앞에 보이는 상이 실재가 아닌 매체를 통한 재현이라는 것을 인<br />
식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의 완전한 몰입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청동거<br />
울에 비친 상을 실재라고 생각한다면, 메두사의 눈도 실제와 같은 위력을 발휘<br />
했을 것이다. 매체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시도되어 왔던 것 중 하나는 대상에<br />
대한 좀 더 완벽한, <strong>매혹</strong>적이고 <strong>압도</strong>적인 시뮬레이션이며, 이러한 상황은 시각<br />
매체가 부상하기 시작한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었다.<br />
지난 세기말의 “이미지로의 전환 der pictorial turn” 3)은 역사 속에서 늘 문자의<br />
경쟁자로 등장했던 이미지의 전면적인 부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매체<br />
의 등장과 함께 다매체적인 인지방식이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br />
것을 알려주고 있다. 4) 더욱이 디지털 매체가 주도매체로 자리 잡기 시작한 이후<br />
부터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들이 대량으로 양산되면서, 대상과<br />
의 거리뿐만 아니라 대상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는 관찰이 나오고 있다. 5) 이와<br />
함께 인터페이스의 이음새는 더욱 매끈해져 우리는 가상공간의 문턱을 더 이상<br />
의식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넘나들게 되었다. 가상공간이 더 이상 대상으로 인지<br />
되지 않는 것이다. 흐릿한 불이 깜빡였던 모니터는 이제 고밀도의 화질로 투명<br />
하게 기능한다. 이렇듯 수용자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br />
고 매체 안으로 완전히 몰입하여 관찰자의 성찰이 중지되었을 때, 바로 메두사<br />
의 눈을 마주보고 마비되어 버린 신화 속 에피소드가 중첩된다.<br />
이 글에서는 이미지가 주도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strong>매혹</strong>과 <strong>압도</strong>, 몰입이라는 현<br />
상을 통해 6) 매체가 수용자에게 가하는 주체적 의식 상실 같은 위력적인 폭력 행<br />
3) Mitchell, William J.: “Der pictorial Turn”, in: Kravagna, Ch. (Hrsg.): Privileg Blick. Kritik<br />
der visuellen Kultur, Berlin 1997, S. 15-40.<br />
4) 이미지가 주도하는 매체에 따른 인지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Großklaus,<br />
Götz: Medien-Zeit, Medien-Raum. Zum Wandel der raumzeitlichen Wahrnehmung in der<br />
Moderne, Frankfurt am Main 1995.<br />
5) Vgl. Baudrillard, Jean: Agonie des Realen, Berlin 1978, S. 40.<br />
6) <strong>매혹</strong>과 <strong>압도</strong>, 몰입은 이미지 매체에서 수용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본 논<br />
문에서는 각각 회화 및 기술적 영상매체, 그리고 디지털 매체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보여주
35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사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대상에 대한 거리를 가<br />
능하게 하는 청동거울로서의 기능도 찾아볼 것이다. 메두사의 눈은 수용자를 압<br />
도하고 마비시키는 <strong>매혹</strong>적이고 감각적인 폭력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매체<br />
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 제정적인 폭력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폭력<br />
에 대항하는 <strong>미학</strong> 전략도 역시 폭력적이라는 점이다. 위력적으로 작용하는 시스<br />
템을 교란하기 위해서 법 파괴적인 폭력의 <strong>미학</strong>은 ‘방해가 되는 방식’이나 ‘의도<br />
적인 단절’로서 등장한다. 창발적 계기로서 법 파괴적인 폭력의 결과는, 관습적<br />
인 매체수용을 전복하고 나타나는 ‘대상과의 가시적인 거리’이다. 바로 이 새롭<br />
게 생성되는 공간에서 수용자가 마주보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생산적인 성찰이<br />
이루어진다.<br />
II.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 - 아름다운 환영<br />
인간의 인지감각 중에 대상의 수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br />
은 시각이다. 예술에 있어 시각으로 전달되는 정보는 인간이 대상을 인지할 때<br />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중에서도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예술형식이<br />
<strong>매혹</strong>적인 것은 우리에게 가상의 세계를 직접 눈앞에서 펼쳐주기 때문이다. 그렇<br />
지만 다른 한편, 짧은 순간에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의 많을수록 수용자의 공간,<br />
즉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덧붙이거나 상상력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br />
축소된다. 정지된 한 순간에 담긴 밀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는 조형예술보다는<br />
시간적 구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문학이 독자의 상상력을 더 자극한다는 것이다.<br />
많은 <strong>미학</strong>자들은 바로 이점에서 문자매체가 시각매체보다 <strong>미학</strong>적으로 우위에<br />
있다고 주장한다. 7) 시각매체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집약적으로 전달해 수용자<br />
의 상상을 제한하는 반면, 문자매체는 시차를 두고 수용자의 창조적인 머릿속에<br />
는 용어로 특성화시키고자 한다. 이는 매체의 기술적 발달단계에서 수용자에 대한 매체의<br />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용<br />
어가 해당되는 특정 매체만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명시해 둔다.<br />
7) U. a.: Lessing, Gotthold E.: Laokoon oder über die Grenzen der Malerei und Poesie (1766),<br />
Stuttgart 1987, S. 114f.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57<br />
서 비로소 “멀티미디어 쇼로 전환된다” 8). 대신 회화에서 사진을 거쳐 영화와 디<br />
지털 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미지 매체들의 장점은 수용자가 재현된 상을 실<br />
제의 세계와 같이 느끼고 그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strong>매혹</strong>적인 감각의 향연이다.<br />
르네 마그리트의 경구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가 지시하는 것처럼 어떠한 이<br />
미지가 매우 사실적인 상태일지라도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br />
만 기술적 매체의 도움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는 사실적 재현의 양상에는 재현된<br />
이미지를 실제의 대상과 혼동하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의 상태가 노골적으로 포<br />
함되어 있다. 이것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간자인 매체의 투명도와 밀접한 관련<br />
을 가지며, 원근법적 환영의 파장 안에서 시작해 디지털 이미지가 구현하는 가<br />
상공간까지 이어진다.<br />
1. <strong>매혹</strong>적인 환영의 세계 - 회화<br />
오랜 시간 서구 회화의 역사를 지배한 것은 바로 환영주의 Illusionismus였다.<br />
현실감의 환상을 주려했던 그리스 고전 예술은 환영주의에 충실했다. 돌로 된<br />
조각상이 금방이라도 피가 돌 것처럼, 그리고 그림에 그려진 대상이 진짜인 것<br />
처럼 느끼게 하는 피그말리온의 욕망이 고대인들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우리나<br />
라에도 8세기 신라 진흥왕 시대 황룡사 법당 외벽에 그린 솔거의 노송도에 <strong>매혹</strong><br />
된 새들이 부딪혀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지만, 그리스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br />
전해진다. 뛰어난 화가였던 파라시우스 Parrhasius와 제우시스 Zeuxis는 서로 경<br />
쟁을 벌였다. 제우시스가 먼저 포도나무를 그리자 새들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br />
날아와 앉았다. 파라시우스는 장막을 그렸는데, 제우시스는 자신의 성공에 고무<br />
된 나머지 파라시우스에게 “어서 장막을 거두고 그림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br />
장막 자체가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제우시스는 “나는 고작 새들을 속였지<br />
만, 파라시우스는 예술가를 속였다”며 자신의 참패를 인정했다. 라캉은 이 예에<br />
서 파라시우스의 응시 9)가 부재를 초월한 실재에 <strong>매혹</strong>되어 환상을 추구했다고<br />
8) Kittler, Friedrich A.: Aufschreibesystem 1800/1900, München 1995 (3. vollst. überarb.<br />
Aufl.), S. 149.<br />
9) 라캉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응시 gaze’를 구분한다. 그저 보는 것과는 다른, 대상을
35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해석한다. 10) 가상이 실재처럼 관찰자를 <strong>매혹</strong>하는 환영주의는 이후 회화의 역사<br />
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통해 꽃을 피우게 된다.<br />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시도된 원근법은 2차원적인 평면에 3차원을 구현하는 길<br />
을 열어주었고, 동시에 마치 그림 내부에서 흘러나와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는<br />
빛의 사용은 이젤 위에 표현된 세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주었다. 11) 서양회화사<br />
에서 최초로 원근법이 쓰였다고 평가되는 그림은 마사치오 Masaccio의 (1428)이다. (그림 1)<br />
이 그림은 성당의 제단위에 그려진 벽화이다. 현대인의 눈으로 보아서는 그리<br />
대단하지 않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방문자들에게는 마치 벽에 깊은 공간<br />
이 실제로 패인 듯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이와 함께 이미지의 유사는 실제 대<br />
상의 특성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눈을 속이는 환영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했다.<br />
벽면에 그려진 입체적 공간은 인공적 원근법이라는 규칙 안에서 구현되며, 이를<br />
통해 2차원의 평면에 보이는 이미지의 환영은 강렬한 가상성을 수용자에게 제<br />
공한다. 이후 크기의 비례를 조절하는 단축법, 명도와 색상에 따른 명암법 등 회<br />
화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이미지 재현의 방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또한<br />
그림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가상적인 빛의 사용도 평면적인 이미지에 놀라운<br />
입체감을 부여했다. ‘빛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러한 효과<br />
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br />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성모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예수에게<br />
밝음과 양감을 선사한다. 빛으로 강조되고 있는 아기와 그 부모를 제외하고는<br />
모두 어둠속에 놓여 있어 전경과 배경은 뚜렷이 구분된다. 이렇게 실제로는 화<br />
폭일 뿐일 평면적인 공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빛을 사용함으로써<br />
입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림을 마주한 수용자는 잠시 이 그림이 평면<br />
인지하는 응시를 통해 상상된 주체와 현실적 주체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게 된다고 보고<br />
있다. 그렇지만 파라시우스의 예에서는 응시가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포착하는데 실패하<br />
고 환상 속으로 빠져든다.<br />
10) Vgl. Wright, Elizabeth: Psychoanalytic Criticism: Theory in Practice, London/New York<br />
1984, p. 119. “He was taken in by the veil-as-representation, as he would have been had he<br />
imagined it to be a real present veil, but his gaze was lured into searching for the fantasy<br />
by the fascination of presence beyond absence.”<br />
11) Vgl. Foucault, Michel: Die Malerei von Manet, Berlin 1999, S. 8f.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59<br />
이고, 화가가 그렇게 상정하고 그렸을 뿐 그림 속 창문으로부터는 어떠한 빛도<br />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이 <strong>매혹</strong>적인 환영의 세계로 기꺼이 빠져들<br />
게 된다.<br />
그림 1. 그림 2. (1640)<br />
2. <strong>압도</strong>적인 사실성의 환상 - 사진과 영화<br />
회화에서 시작된 시각적 환영주의는 사진이라는 기술적 매체의 발달과 함께<br />
‘정보의 직접적 전달’이라는 강도 높은 유사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앞서 회화<br />
에서 보여주었던 선택적 유사의 상태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사진의 사실성은 마<br />
치 ‘가공되지 않은 현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주제와 관계없<br />
는 부분까지 가해지는 사진과 같은 정밀한 묘사 방식은 회화의 역사 속에서 그<br />
리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12) 대부분의 회화에서 이미지의 묘사는 작가에 의해<br />
조절되며, 필요한 정도까지만 사실적으로 묘사된다. 바로 여기에서 대상에 대한<br />
주관화가 일어나며, 이것이 예술적인 이미지와 실제의 이미지를 구분하는 지표<br />
이기도 했다. 이제 사진이 가진 <strong>매혹</strong>적 힘의 근원은 가상이 실재처럼 묘사되는<br />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상이 현실의 지표로서 제시된다는 데 있다. 사진 매체의<br />
12) 한스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3, 1장 ‘유사성의 한계’ 참조.
36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늘 경고되어 왔지만, 13) 우리는 사진으로 접하는 이미지<br />
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이미 되었다고 상정하기 쉽다. 매체를 통해 유포<br />
된 사진 한 장이 ‘내가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경험했음을’ 입증하는 요소가 된다<br />
는 것이다. 사진 매체가 실현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밀도의 상승도 수용자에게<br />
진짜라는 환상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무리 정밀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주<br />
관적인 왜곡과 변형이 일어나는 인간의 눈과는 달리, 카메라 장치에 의한 기계<br />
적 시선은 완전히 객관적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br />
여기에 움직이는 영상이라는 영화매체의 시간적 요소가 더해지면 수용자의<br />
몰입은 가속화된다. 영화는 마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사실<br />
성을 가지고 있다. 영화에 속한 사실성은 실제로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br />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 행동을 했다는 물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렇지만 물<br />
론 영화에 등장한 배우가 실제 영화 속의 인물은 아니며, 실제로 그러한 사건들<br />
을 경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 영화가 가진 허구성이다. 그렇지만 더 엄밀히 관<br />
찰하면, 영화의 가상성은 이미 매체형식에 본질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영화가<br />
완전한 사실만을 기록했다 하더라도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적 편집이라는 요소<br />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화는 그 형식 자체가 이미 잔상효과라는 눈속임<br />
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로는 스틸사진에 불과한 정지된 이미지들이 1초에 24<br />
번 연속적으로 제시됨으로 관객들이 이들을 움직이는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사<br />
실이 영화의 환영성을 구성한다. 이제 멈추어져 제공되었던 ‘현실의 단면’은 현<br />
실세계와 동일한 운동성까지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strong>압도</strong>적인 이미지에<br />
대한 <strong>매혹</strong>적인 경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벽한 환상의 구현에 대한 요구로<br />
바뀌게 된다.<br />
많은 이론가들이 3차원의 가상세계를 구현하려는, 회화로부터 계속되어 온<br />
사진과 영화의 환영주의적 성격과 계속 더해가는 기술적인 요구에 주목한다. 예<br />
를 들면 곰브리치 Hans E. Gombrich는 이를 그의 저서『예술과 환영』에서 다음<br />
13) Vgl. Brecht, Bertolt: Der Dreigroschenprozess. Ein soziologisches Experiment, in: Schriften<br />
zur Literatur und Kunst. Bd. 1. 1920–1939 (Hrsg. v. Hecht, Werner), Berlin/Weimar 1966,<br />
S. 185. “Eine Photographie der Kruppwerke oder der AEG ergibt beinahe nichts über diese<br />
Institute. Die eigentliche Realität ist in die Funktionale gerutscht.”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br />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61<br />
영화가 처음으로 삼차원의 세계를 소개했을 때, 우리들의 기대와 체험의 거리는 너<br />
무나도 좁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환영의 전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일<br />
단 기대치가 한 단계 올라가면 그 환영은 낡아서 희미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br />
당연하게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다. 14)<br />
회화나 사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환영성은 우리에게 실재와 같은, 혹은 실재<br />
라고 여겨지는 아름다운 가상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기꺼이 이 가상의 세계에<br />
빠져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점점 더 <strong>압도</strong>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미지<br />
의 위력은 감각의 향유를 제공하는 대신, 성찰의 기회를 가져간다. 우리는 회화<br />
의 아름다운 세계가 실은 이젤 위에 물감이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이상은<br />
아니라는 점은 기억하지 않는다. 또한 영화가 우리 세계와 동일한 차원의 운동<br />
성을 통해 스크린 위에 펼쳐 보여주는 내용에 깊이 빠져들며, 이때 평면적인 스<br />
크린 위로 영사기가 돌아가며 화면을 송신한다는 것을 굳이 인지하지 않는다.<br />
매체의 물질적이고 기능적인 면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깨끗한 창문처럼 기능할수<br />
록 매체가 담고 있는 내용은 손실 없이 전달된다. 이러한 매체의 투명성이 사실<br />
예술사를 지배해 온 원칙이기도 했던 것이다. 20세기 초의 모던이라는 짧은 기<br />
간 동안 예술에 있어서 내용보다는 전달하고 있는 재료, 즉 매체성이 강조되었<br />
던 것은 전체 예술의 역사에서 볼 때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br />
이제 영화의 환영성은 디지털 매체에서 가상공간과 가상현실의 환영성으로<br />
이어진다. 그리고 시각적 환영주의는 여기에서 촉각적 환영주의로 이행된다.<br />
3. 경계의 상실과 몰입 - 가상공간<br />
회화에서 사진으로, 다시 움직이는 동영상인 영화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br />
인터넷 가상공간에서의 비주얼화까지, 시각 매체의 역사에서 중요한 <strong>미학</strong>적 역<br />
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상 중의 하나는 바로 몰입이다. 몰입은 현실과 다른 세계<br />
14) 한스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83쪽.
36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로 빠져 들어가는 경험이며, 이미지를 전달하는 매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br />
작품의 수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험이 기존 예<br />
술에서는 수용자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는 반면, 디지털 공간에서는 수용자가<br />
다른 세계, 즉 가상 세계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강조된다는 것이 이전<br />
과는 다른 점이다. 디지털 매체가 구현하는 이미지의 촉각적 성격은 마치 만져<br />
봐도 그 대상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 같은 기술적 극사실주의로부터 기인한다.<br />
대상의 표면을 극단적으로 섬세히 묘사하는 극사실적인 세계는 15) 몸으로 체험<br />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만나 회화로부터 시작되었던 이미지 매체의 환<br />
영성을 이제 촉각적으로 완성시킨다. 여기에서 완전한 몰입이란 대상에 고도로<br />
집중하여 마치 주체가 대상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처럼 더 이상 대상의 외적 환<br />
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뜻한다.<br />
따라서 현실이 아닌 예술적 공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매체에서 몰<br />
입의 가능성은 주체와 대상간의 경계를 해체하며 예술 자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br />
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strong>몰입의</strong> 문제는 수용자가 더 이상 현실<br />
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인지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 보드리야드는 오늘날 대다수<br />
인류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조작적 시뮬레이<br />
션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16) 재현된 이미지와 현실의 혼동은, 이<br />
제 원본 없는 극사실적인 이미지들과 일상에 범람하게 된 합성의 상태를 통해<br />
매우 전면적이고 문화적인 양상이 되었다. 17)<br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이공간 Zwischenräume’의 상실이다. 기술적 매<br />
체가 발달하면서 심미적 대상이 자신의 내부에 지니고 있는 빈 공간, 혹은 대상<br />
과의 거리는 <strong>매혹</strong>과 <strong>압도</strong>, 그리고 <strong>몰입의</strong> 현상을 통해 점점 축소되어 왔다. 이<br />
틈새는 앞서 서술했듯이 수용자의 상상력과 성찰을 위한 공간이다. 기술적 완벽<br />
화는 이미 완성된 <strong>매혹</strong>적인 환영의 세계와 다매체적 감각을 제공하며 수용자와<br />
대상과의 사이에 공간을 남겨놓지 않는다. 수용자의 상상력이라는 심급에서는<br />
15) 이러한 극사실주의 기법은 회화로부터 시작되어 사진 및 영화, 그리고 디지털 매체로 이어<br />
진다. 회화에서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베르메르 J. Vermeer가 보여준 물질적 표면성에<br />
대한 관심과 섬세한 표현이 그 시작으로 여겨진다. 위의 책 참조.<br />
16) Vgl. Baudrillard, Jean: Das Jahr 2000 findet nicht statt, Berlin 1990.<br />
17) 레프 마노비치: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역, 생각의 나무 2004, 224쪽 참조.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63<br />
글보다는 회화가, 회화보다는 사진이, 사진보다는 영화가 틈새가 더 적어진다.<br />
이제 균질한 표면을 제공하는 디지털 매체의 가상공간에서 틈새는 거의 보이지<br />
않는다. 매체학자 마투섹 P. Matuss다이 완전한 <strong>몰입의</strong> 예로 들고 있는 한 컴퓨<br />
터게임의 광고는 이전의 단조로운 컴퓨터게임이 아닌, 화려한 멀티미디어로 구<br />
성된 사용자 환경을 약속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모니터 앞의 수용자는 즐겁다기<br />
보다는 조증에 가까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신경증을 보여준다. 18) 모니터에 나<br />
타난 감각의 극대화된 효과 앞에서 사용자의 성찰은 중지된다. (그림 3)<br />
그림 3. 컴퓨터 게임의 광고 <br />
가상공간 안에서 직접 ‘몸’으로 상호작용을 즐기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br />
는 믿음은 디지털 매체가 제공하는 열기 속에서 현기증처럼 작동한다. 실제로<br />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닌 대상이며,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미리 프로그<br />
램화된 계산된 작동이라는 점은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기술적 세련화와 완벽화<br />
는 일반적 수용자를 모니터의 피상성 위에만 머무르게 하고 수용자의 실제적 개<br />
입을 차단해왔던 것이다. 때문에 디지털시대에 다시 극단적으로 등장하고 있는<br />
기술적 환영주의 안에서도 수용자가 빈 공간을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사이<br />
공간을 복원해내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이공간을 갑작<br />
스러운 단절이나 방해의 방법으로 복원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br />
기에서 성찰의 가능성은 흥미롭게도 실제적인 ‘거울’의 기능을 통해 등장한다.<br />
18) Matussek, Peter: Aufmerksamkeitsstörungen. Selbstreflexion unter den Bedingungen digitaler<br />
Medien, in: Assmann, Aleida und Jan (Hg.): Aufmerksamkeiten, München 2001, S. 197-215.
36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III. 사이공간의 등장 - 청동거울로서의 매체<br />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매체환경을 급진적으로 파괴한다는 것, 즉 익숙한<br />
정보의 저장, 전달과 재현방식을 갑자기 낯설게 만드는 방식들은 무엇보다 지난<br />
세기 예술의 역사에서 선취된 바 있다. 세기말부터 시작된 아방가르드 회화는<br />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재료 자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며, 이를 주제화하는<br />
데 주력했다. 내용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게 물러나<br />
있던 재료의 물질성이 작품 전면에 등장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br />
푸코가 남긴 유작원고에 의해서 얼마 전부터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마네<br />
Edouard Manet(1832-1883)의 그림들은 마네가 세기말 아방가르드의 실험이 시작<br />
되기 이미 이전에 이미지의 환영주의적 성격을 깨는데 주력했음을 보여주고 있<br />
다. 거리를 두고서 예술의 허구적 성격을 읽어내도록 환기시켜주는 어떤 단절적<br />
인 측면이 예술 속에 내재해 있는 셈이다.<br />
푸코는 마네를 회화역사 전체에서 최초의 “단절 Bruch”를 가져온 작가라고<br />
평가한다. 19) 환영주의라는 회화사의 유구한 흐름을 깨는 단절이라는 위력적인<br />
면모는 화면의 공간, 조명, 관찰자의 위치 20)를 바꾸어 버린 시도에서 드러난다.<br />
마네는 아마도 최초로 회화를 객체로, 물질성으로, 다시 말해서 단지 외부로부터만<br />
조명을 받는, 색이 칠해진 대상으로 고안해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정해진 자리<br />
없이) 관찰자는 이리 저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21)<br />
푸코가 가장 중심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작품은 1881년에 그려진 이다. (그림 4)<br />
19) Foucault, Michel: a.a.O., S. 5.<br />
20) Ebd., S. 9.<br />
21) Ebd., S. 10. “Manet erfindet aufs neue, womöglich zum ersten Mal, das Bild als Objekt, das<br />
Bild als Materialität, als farbigen Gegenstand, der von einem äußeren Licht beleuchtet wird<br />
und vor dem und um das herum sich der Betrachter bewegen kann.”
그림 4. <br />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65<br />
전면에 서 있는 것은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종업원이다. 그녀의 뒤로 사람들<br />
로 꽉 차 있는 술집의 내부가 펼쳐진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술집<br />
내부의 풍경은 여종업원 뒤에 세워진 커다란 거울 22)을 통해 반사된 모습이라는<br />
걸 알 수 있다. 그녀의 손 뒤로 거울의 테두리인 황금색 틀이 보인다. 특히 그녀<br />
의 왼손 뒤에 있는 황금색 틀을 보면 뒤쪽에 서 있는 인물이 거울 속의 반사상<br />
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바로 이 작품에서 가장 기이한 것이 오른쪽으로 비스<br />
듬히 보이는 이 뒷모습이다. 작가가 ‘관찰자의 위치'를 지금까지 모든 회화작품<br />
에서 그러했듯이 중앙으로 상정했다면 나올 수 없는 방향에 뒷모습이 반사되고<br />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관객은 그림의 바로 앞이라는<br />
관습적인 자리를 떠나 좀 더 왼쪽으로 자신의 관찰지점을 옮겨야 한다. 푸코는<br />
이를 마치 극장에서처럼 항상 중앙에서 그림을 관람해야 했던 관객의 자리를 바<br />
꿔버린 혁명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 23) 그렇지만 여기에서 관찰자의 자리가 옮<br />
22) 회화의 역사에서 ‘거울’의 트릭을 사용하여 보이지 않았던 작가의 시점을 드러내거나, 보<br />
이는 것 이외의 공간을 표현하는 등의 시도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 작품이 보<br />
여주는 거울의 새로운 의미는 이번에는 관찰자의 위치를 바꾸어 수용자의 성찰을 촉진시<br />
켰다는 점에 있다. 푸코는 다른 글에서도 거울이 가진 의미를 분석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br />
자면 거울은 동시에 서로 다른 세계, 즉 현실과 가상을 관찰자에게 지시해주는 공간이다.<br />
여기에서 푸코가 의미하는 거울은 다름 아닌 수용자의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공간이<br />
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다. Foucault, Michel: Andere Räume, in: Barck, K./Gente, P./Paris,<br />
H./Richter, S. (Hrsg.): Aisthesis. Wahrnehmung heute oder Perspektiven einer anderen<br />
Ästhetik, Leipzig 1998, S. 34-46.<br />
23) Vgl. Ebd., S. 8f. u. S. 46. “Mit dieser Technik hat Manet die Eigenschaft des Gemäldes ins<br />
Spiel gebracht, kein normativer Raum zu sein, dessen Darstellung den Betrachter auf einen
36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겨졌다는 것 외에도 이 순간이 주는 효과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것은 수용자가<br />
관찰지점을 옮김으로 해서 그와 작품사이에 있는 공간이 갑자기 존재감을 드러<br />
낸다는 사실이다. 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 서 있는 지점을 옮겨가면서,<br />
수용자는 이 작품이 화폭 위의 그림임을,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앞에 서 있음을<br />
새삼스레 인지한다. 동시에 이 그림 앞에는 공간이 생성되는 것이다.<br />
영화매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수용자와 대상간의 공간을 재인식하게 하는<br />
시도가 고다르 Jean-Luc Godard에게서 발견된다. 고다르는 브레히트의 ‘낯설게<br />
하기’ 기법을 영화에 활용하여 연극을 보는 관객과 마찬가지로 영화의 관람객도<br />
대상과의 거리를 가지고 내용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했다. 이런<br />
시도는 필름이 영사되고 있는 동안 관객에게 보이지 않는 화면을 활용한 오프<br />
스크린 Off-Screen 기법이라던가, 편집하고 있는 시점을 노출하지 않는 일반적인<br />
비가시편집 원칙을 깨뜨리는 점프 컷 Jump-Cut 24) 등의 활용으로 나타난다.<br />
그중에서도 고다르의 후기작 (1962)에서는 매우<br />
흥미로운 시퀀스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장면은 마치 마네의 <br />
를 연상시키는 미장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br />
바에 뒤돌아 앉아 있는, 전면에 위치한 여주인공 나나의 어깨 너머로 거울이<br />
보이고 여기에서도 나나의 모습이 거울에 반사되어 나타난다. 그렇지만 이 장면<br />
에서 부각되는 것은 마네의 경우에서처럼 회화매체의 전통을 단절시키는 위치<br />
변경이 아니다. 고다르는 이번에는 지극히 관습적인 영화매체의 기법을 의도적<br />
으로 깨고 있다. 인물이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있고, 그 내용은 맞은 편 거울에<br />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당시 극영화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구도로 화면을 잡아내<br />
고 있는 것이다. 관객들은 나나의 대사와 저 멀리 거울에 반사된 희미한 나나의<br />
표정을 관찰하며 매우 힘들게 여주인공의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다. 가끔 지<br />
나가는 바텐더를 피해가며 거울 속의 그녀를 관찰하기 위해서 관객은 자신의 몸<br />
einzigen Punkt festlegt, von dem aus er betrachtet, sondern ein Raum, dem gegenüber man<br />
verschiedenen Position einnehmen kann.”(46)<br />
24) 점프 컷은 정지해 있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움직이는 대상을 디졸브 등의<br />
중간효과 없이 그대로 끊어서 보여주는 기법이다. 이외에도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으로<br />
영화의 매체성을 드러내려는 시도는 이중인화, 병렬편집, 쇼트 안의 심도 표현 등으로 다<br />
양하게 이루어졌다.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67<br />
을 화면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 바로 관객의 투명한 관람이 폭력적으<br />
로 방해받은 이 순간, 이 영화는 3차원의 움직이는 가상이 아니라, 평면 스크린<br />
위에 영사된 화면이 되고, 그 화면 앞 수용자와 스크린 사이의 공간은 다시금 그<br />
존재감을 얻게 된다.<br />
그림 5. <br />
지금까지 살펴본 관습적인 매체수용방식을 깨뜨리는 사례들은 우리가 살고<br />
있는 지금, 즉 디지털 매체로의 가히 전면적인 전환이 시작된 시점에서 새롭고<br />
급진적인 매체<strong>미학</strong>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br />
체작품에서 이러한 단초를 찾아본다면, ‘혼합현실 Mixed Reality’이라는 장르에<br />
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우터백 C. Utterback의 (2001-2002)를 들 수 있다. (그림 6)<br />
이 작품은 처음에는 관람자에게 매우 혼란을 준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장면은<br />
단일하지 않으며, 또 무언가에 의해 계속 방해받아 끊어지고, 동일한 화면에서<br />
도 단절이 일어난다. 면밀히 관찰하다보면, 작품의 화면 위에는 서로 다른 차원<br />
에 있는 다수의 현실들이 교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우선 파악할 수 있는 장면<br />
은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바쁜 일상과 도쿄에 있는 사원 안의 한가로운 풍<br />
경이다. 그렇지만 서로 번갈아 나타나는 이 두 세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br />
서 두 개의 현실이 만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지한 세계와 움직이는 세계이<br />
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지한 세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계는 다름 아닌 관람<br />
자인 ‘나’의 몸이 투영된 부분이다. 상호작용적으로 설치된 이 작품은 관람객의<br />
움직임에 따라 화면 안의 정지된 부분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 관람객의 몸이<br />
화면을 떠나면 움직였던 세계는 다시 멈춘다. 이제 관람객의 존재는 정지한 세
36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계를 생동하는 세계로 만드는 신적인 구현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동시에 작<br />
품이 재현되는 화면은 나의 ‘몸’을 비추는 거울로 전환된다. 이 공간 안에서 주<br />
체의 움직임은 메타포로서의 ‘움직임’이 아닌 상이한 현실 사이를 매개하는 직<br />
접적인 몸의 구현이다. 서로 다른 추가적인 현실들을 통합하는 매개자는 바로<br />
현실들의 차이를 마주보고 서 있는 주체라는 것이다. 자신의 몸을 작품 안에서<br />
움직임을 일으키는 동인으로 새롭게 재발견한 수용자는 작품과 자신의 ‘몸’과의<br />
거리도 다시금 인식하게 된다. 역시 이 작품에서도 작품 앞의 공간이 실제적으<br />
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br />
그림 6. <br />
이렇듯 이미지가 가지는 강렬한 <strong>매혹</strong>과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현상을 통해 계속해서<br />
수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온 디지털 매체예술에 있어서, 이와 반대방향<br />
의 폭력적 <strong>미학</strong>을 성취하기 위해 수용자가 실제로 자신의 위치를 인지하고 그<br />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br />
IV. 나오는 글<br />
지금까지 이미지 매체를 중심으로 관습적 수용이 주는 환영성과 이를 탈피하<br />
려는 <strong>미학</strong>적 시도들을 살펴보았다. 3차원적인 공간을 2차원 위의 평면 위에 펼<br />
쳐 보이는 회화, 현실 그 자체의 지표로서 제시되는 사진 그리고 현실과 동일한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69<br />
운동성을 획득한 영화가 주는 <strong>매혹</strong>적이고 <strong>압도</strong>적인 몰입에서 빠져나오려는 시<br />
도는 주도적인 매체수용환경을 강제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력<br />
적인 매체의 영향력에 반하는 예술의 저항 역시 폭력적인 것이다. 여기에서 폭<br />
력이 가진 체제를 공고화하는 기능과 정체된 체제를 변동시키는 이중적인 면모<br />
가 관찰된다. 전율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형식으로서의 매체예술의 도전은<br />
청동거울처럼 기능하며 대상과의 거리를 복구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성찰하<br />
게 도와주는 예술작품 고유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기존예술의 경계를 넘어<br />
섬으로써 예술의 내면과 외면을 확장하고, 예술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해준다고<br />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지 주도적인 다른 아날로그 매체의 경우와 달리 디지<br />
털 매체에서 이러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다. 모사할 원본을 따로 가지고 있지<br />
않은 디지털 이미지의 환영성은 실재와 가상의 구분에 대한 질문 자체를 무의미<br />
하게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성찰의 순간은<br />
순간적이며, 더 이상 매체의 외부에 존재하는 공간을 보존하기는 매우 어렵다.<br />
수용자를 위한 전통적 공간, 즉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의 경계조차<br />
사라진 매체예술이 과연 괴물 메두사의 피 속에서 천마(天馬) 페가소스가 탄생<br />
했듯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점점 더 그 세력을 현실<br />
세계 속으로 확장해가고 있는 디지털 가상공간에 직면하여 매체의 성격과 예술<br />
에 미칠 폭력적인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인문학 연구<br />
에서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될 것이다.<br />
참고문헌<br />
발터 벤야민: 폭력의 비판을 위하여, 이성원 역, 실린 곳: 자율평론 2호 (2002. 12. 28).<br />
레프 마노비치: 뉴미디어의 언어, 서정신 역, 생각의 나무 2004.<br />
한스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술과 환영, 차미례 역, 열화당 2003.<br />
Baudrillard, Jean: Das Jahr 2000 findet nicht statt, Berlin 1990.<br />
Baudrillard, Jean: Agonie des Realen, Berlin 1978.<br />
Benjamin, Walter: Zur Kritik der Gewalt, in: Walter Benjamin. Gesammelte Schriften,<br />
unter Mitw. von Theodor W. Adorno u. Gershom Scholem, hrsg. von Rolf
37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Tiedemann u. Hermann Schweppenhäuser, Bd. II/1, Frankfurt am Main 1977, S.<br />
179-203.<br />
Brecht, Bertolt: Der Dreigroschenprozess. Ein soziologisches Experiment, in: Schriften<br />
zur Literatur und Kunst, Bd. 1, 1920–1939 (Hrsg. v. Hecht, Werner), Berlin/<br />
Weimar 1966.<br />
Großklaus, Götz: Medien-Zeit, Medien-Raum. Zum Wandel der raumzeitlichen Wahrnehmung<br />
in der Moderne, Frankfurt am Main 1995.<br />
Foucault, Michel: Die Malerei von Manet, Berlin 1999.<br />
Foucault, Michel: Andere Räume, in: Barck, K./Gente, P./Paris, H./Richter, S. (Hrsg.):<br />
Aisthesis. Wahrnehmung heute oder Perspektiven einer anderen Ästhetik,<br />
Leipzig 1998.<br />
Kittler, Friedrich A.: Aufschreibesystem 1800/1900, München 1995. (3. vollst. überarb.<br />
Aufl.)<br />
Lessing, Gotthold E.: Laokoon oder über die Grenzen der Malerei und Poesie (1766),<br />
Stuttgart 1987.<br />
Matussek, Peter: Aufmerksamkeitsstörungen. Selbstreflexion unter den Bedingungen<br />
digitaler Medien, in: Assmann, Aleida und Jan (Hrsg.): Aufmerksamkeiten,<br />
München 2001, S. 197–215.<br />
Mitchell, William J.: “Der pictorial Turn”, in: Kravagna, Ch. (Hrsg.): Privileg Blick.<br />
Kritik der visuellen Kultur, Berlin 1997.<br />
Schwarte, Ludger: Das Einräumen von Bildlichkeit. Wahrnehumgshandlungen und<br />
Ausstellungsarchitektur, in: Wulf, Christoph/Zirfas, Jörg(Hg.): Ikonologie des<br />
Performativen, München 2005, S. 279-299.<br />
Utterback, Camille: liquid time series - Tokyo, New York (2001-2002), im Netz:<br />
http://www.camilleutterback.com<br />
Wright, Elizabeth: Psychoanalytic Criticism: Theory in Practice, London/New York<br />
1984.
Zusammenfassung<br />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strong>몰입의</strong> <strong>미학</strong>․최문규/유현주 371<br />
Ästhetik der Faszination, Überwältigung, Immersion<br />
- Gewalt der Medien und die Möglichkeit der Reflexion<br />
Choi, Moon-gyoo (Yonsei Uni) / Yoo, Hyun-Joo (Chung-Ang Uni)<br />
Das Element 'Gewalt' existiert immer und überall in der menschlichen Geschichte,<br />
von den mythischen Figuren bis zum digitalen Medienbild. Der Begriff der Gewalt<br />
hat die Definition von 'elementare(n) Kraft von zwingender Wirkung'(Duden) außer<br />
der allgemeinen Bedeutung 'gegen jemanden angewendete(n) physische(n) Kraft'.<br />
Gerade in diesem erweiterten Sinne wird der Gewaltbegriff in der ästhetischen Studie<br />
verwendet. Darüber hinaus zeigt sich das Verhältnis von Gewalt und Kunst am<br />
deutlichsten in Bezug auf Medienformen. Denn gewalttätige Phänomene fallen fast<br />
immer dann ausnahmslos auf, wenn neue Medienformen auftreten und einige davon<br />
sich als das leitende Medium durchsetzen.<br />
Dieser Aufsatz setzt sich zum Ziel, die Art und Weise solcher Gewaltdarstellungen in<br />
den Bildmedien - Malerei, Foto, Film und die virtuelle Realität - zu analysieren. Um<br />
dieses Ziel zu erreichen, wendet die vorliegende Arbeit zuerst der Janusköpfigkeit der<br />
Gewalt ihre Aufmerksamkeit zu. Mit der Unterscheidung von der rechtsetzenden und<br />
der rechtserhaltenden Gewalt versuchte Walter Benjamin sich von der einseitigen<br />
Denkweise bezüglich der Gewalt zu distanzieren. Der Versuch dieser Arbeit, nicht<br />
die inhaltliche Darstellung der Gewalt in den verschiedenen Bildmedien, sondern<br />
vielmehr die Problematik der durch die Medienformen implizit ausgeübten Gewalt in<br />
Betracht zu ziehen, ist eng mit der Absicht verbunden, gerade die Janusköpfigkeit der<br />
Gewalt zu beobachten. Denn ihre beiden Seiten, nicht nur die negativen Momente<br />
von Zwängen und Verblendung ausgedrückt durch die Phänomene wie Faszination,<br />
Überwältigung, Immersion, sondern auch die positiven schöpferischen Momente von
37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Schaffen und Entstehen, die den Rezipienten selbst zur Reflexion auf das Medium<br />
führen, gibt die Gewalt nur insonfern zu erkennen, als auf die Gewalt aufmerksam<br />
gemacht wird, die im Rezeptionsprozess der Medienformen als 'Bruch' oder 'Störung'<br />
in Erscheinung tritt.<br />
주제어: 매체의 폭력, 환영주의, <strong>매혹</strong>, <strong>압도</strong>, 몰입, 성찰<br />
Schlüsselbegriffe: Gewalt der Medien, Illusionismus, Faszination, Überwältigung, Immersion,<br />
Reflexion<br />
필자 E-Mail: mkchoi@yonsei.ac.kr, iha413@empal.com<br />
투고일: 2009.09.26 / 심사일: 2009.10.19 / 심사완료일: 200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