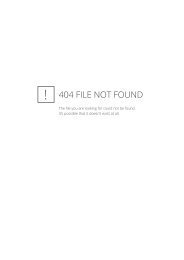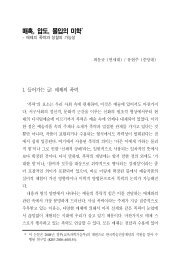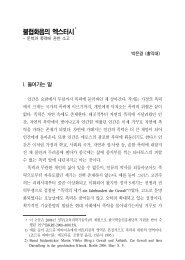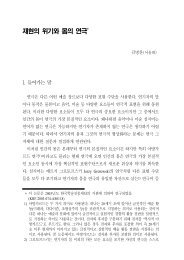게르하르트 하웁트만의 그리고 피파는 춤춘다!의 상징 과 생철학
게르하르트 하웁트만의 그리고 피파는 춤춘다!의 상징 과 생철학
게르하르트 하웁트만의 그리고 피파는 춤춘다!의 상징 과 생철학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게르하르트</strong> <strong>하웁트만<strong>의</strong></strong>
재현된 현실<strong>과</strong> 그 현실 뒤에서 작용하는 신비적인 자연<strong>의</strong> 힘이 다양한 신화적<br />
모티브와 함축적 언어, <strong>그리고</strong> <strong>상징</strong>적 사건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다.<br />
따라서 이 작품은 자연주<strong>의</strong>에서 신낭만주<strong>의</strong>에까지 이르는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폭넓은<br />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그<strong>의</strong> 독특한 문학세계가 잘 압축되어 있다고<br />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양식요소<strong>의</strong> 등장<strong>과</strong> 신화적 모티브가 주<br />
는 <strong>상징</strong>성, 압축된 언어<strong>의</strong> 암시성 등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동시<br />
에 작품<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를 좀처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초연 후 한 세기<br />
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br />
상황이 그것을 말해준다.<br />
이 글은 하웁트만 문학<strong>의</strong> 배경<strong>과</strong> 기본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이 작<br />
품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strong>상징</strong>적 인물<strong>과</strong><br />
사건들이 가진 다양한 <strong>의</strong>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사상적 배경으로서<strong>의</strong> 생철<br />
학 Lebensphilosophie에 대한 검토는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br />
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배경<strong>과</strong> 성격에 대한 검토는 자연주<strong>의</strong> 작품에 치중되어<br />
있는 우리<strong>의</strong> 하웁트만 연구 실정을 감안할 때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본령에 대한 이해가<br />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3) 하나<strong>의</strong> 방법론을 택해 새로운 <strong>의</strong>미를 찾아내기보다<br />
이미 발표된 논문들에 <strong>의</strong>지하여 <strong>의</strong>미<strong>의</strong> 다양성을 확인하려는 것은 이 작품에 대<br />
한 기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해한 작품을 논<strong>의</strong><br />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동<strong>의</strong> 이해가 선행된다면 논<strong>의</strong>는 훨씬 효율적<br />
일 것이라 생각된다.<br />
II. 양식다원주<strong>의</strong>와 <strong>생철학</strong><br />
독일은 1871년<strong>의</strong> 통일 이후 가속적인 산업화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br />
류사회가 사용하는 고급 유리그릇들을 생산하고 있다.<br />
3) 하웁트만 문학<strong>의</strong> 본령이 자연주<strong>의</strong>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신낭만주<strong>의</strong>적 작품 셋을 묶어<br />
연구한 학위논문이 최근에 나온 바 있다.
재현된 현실<strong>과</strong> 그 현실 뒤에서 작용하는 신비적인 자연<strong>의</strong> 힘이 다양한 신화적<br />
모티브와 함축적 언어, <strong>그리고</strong> <strong>상징</strong>적 사건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다.<br />
따라서 이 작품은 자연주<strong>의</strong>에서 신낭만주<strong>의</strong>에까지 이르는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폭넓은<br />
스펙트럼이 나타나 있으며, 동시에 그<strong>의</strong> 독특한 문학세계가 잘 압축되어 있다고<br />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양식요소<strong>의</strong> 등장<strong>과</strong> 신화적 모티브가 주<br />
는 <strong>상징</strong>성, 압축된 언어<strong>의</strong> 암시성 등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제공하면서 동시<br />
에 작품<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를 좀처럼 포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초연 후 한 세기<br />
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만족할 만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br />
상황이 그것을 말해준다.<br />
이 글은 하웁트만 문학<strong>의</strong> 배경<strong>과</strong> 기본적인 성격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이 작<br />
품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몇 가지 중요한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strong>상징</strong>적 인물<strong>과</strong><br />
사건들이 가진 다양한 <strong>의</strong>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사상적 배경으로서<strong>의</strong> 생철<br />
학 Lebensphilosophie에 대한 검토는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br />
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배경<strong>과</strong> 성격에 대한 검토는 자연주<strong>의</strong> 작품에 치중되어<br />
있는 우리<strong>의</strong> 하웁트만 연구 실정을 감안할 때 그<strong>의</strong> 문학<strong>의</strong> 본령에 대한 이해가<br />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이다. 3) 하나<strong>의</strong> 방법론을 택해 새로운 <strong>의</strong>미를 찾아내기보다<br />
이미 발표된 논문들에 <strong>의</strong>지하여 <strong>의</strong>미<strong>의</strong> 다양성을 확인하려는 것은 이 작품에 대<br />
한 기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해한 작품을 논<strong>의</strong><br />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공동<strong>의</strong> 이해가 선행된다면 논<strong>의</strong>는 훨씬 효율적<br />
일 것이라 생각된다.<br />
II. 양식다원주<strong>의</strong>와 <strong>생철학</strong><br />
독일은 1871년<strong>의</strong> 통일 이후 가속적인 산업화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는다.<br />
류사회가 사용하는 고급 유리그릇들을 생산하고 있다.<br />
3) 하웁트만 문학<strong>의</strong> 본령이 자연주<strong>의</strong>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며 신낭만주<strong>의</strong>적 작품 셋을 묶어<br />
연구한 학위논문이 최근에 나온 바 있다.
<strong>의</strong>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들<strong>의</strong> 제일<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제로 설정하게 된다. <strong>그리고</strong> 이 <strong>과</strong><br />
제는 눈부시게 발전한 <strong>과</strong>학<strong>과</strong> <strong>과</strong>학<strong>의</strong> 도구인 오성 Verstand으로 해결할 수 있는<br />
문제가 아니었다. 위기<strong>의</strong>식<strong>의</strong> 중심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현상은 <strong>과</strong>학적으로 설<br />
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상상<strong>과</strong> 직관으로 진<br />
실을 포착하는 시인/작가들이 짊어져야 할 일이었다.<br />
그러나 문학은 곧 난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문학<strong>의</strong> 수단은 불완전한 것인데도<br />
그것을 가지고 신비<strong>의</strong> 현상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strong>의</strong> 작<br />
가들은 신비<strong>의</strong> 생명현상을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불가능<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제를 떠<br />
맡게 되었다. 그것이 호프만스탈<strong>의</strong> 샨도스 편지 6)에 대변된 당시<strong>의</strong> 언어회<strong>의</strong><strong>의</strong><br />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trong>과</strong>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고, 새<br />
로운 언어를 얻기 위해서는 끝없는 실험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식다원주<strong>의</strong><br />
는 여기에 기인한다.<br />
일반적인 <strong>의</strong>미에서 <strong>생철학</strong>은 우리 삶<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와 가치, 목적을 관념적이고 이론<br />
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실존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하지<br />
만 철학적 경향으로서<strong>의</strong> <strong>생철학</strong>은 특히 19세기 후반<strong>과</strong> 20세기 초 독일<strong>과</strong> 프랑스<br />
에서 사상적 흐름을 주도했던 생명 중시 운동을 말한다. 시대<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학적 경향에<br />
대항하여 일어난 이 운동은 무엇보다 계몽주<strong>의</strong> 합리성 중시에 반발하여 일어난<br />
18세기 슈트름운트드랑 Sturm und Drang<strong>의</strong>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br />
살아있는 것<strong>과</strong> 죽은 것, 구체적인 것<strong>과</strong> 추상적인 것, 유기적인 것<strong>과</strong> 기계적인<br />
것, 동적인 것<strong>과</strong> 정적인 것을 대립시켜 전자를 후자들<strong>의</strong> 우위에 두었던 이 경향<br />
은 이상주<strong>의</strong> 철학<strong>과</strong> 삶, 시와 사상을 통합하려는 낭만주<strong>의</strong>로 이어졌다. 그러나<br />
<strong>생철학</strong><strong>의</strong> 직접적인 출발은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와 니체 Friedrich<br />
Nietzsche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것은 베르그송 Henri Bergson<strong>과</strong> 딜타이<br />
Wilhelm Dilthey, <strong>그리고</strong> 그들 동시대<strong>의</strong> 많은 철학자들이었다.<br />
<strong>생철학</strong>은 물질세계에 우선하여 살아있는 생명<strong>과</strong> 실제로 체험하는 삶에 중심<br />
을 두는데, 이 중심이 되는 생명<strong>의</strong> 성격은 베르그송<strong>의</strong> 개념 ‘élan vital’에 잘 함<br />
축되어 있다. 이것은 “존재<strong>의</strong> 모든 영역을 통괄하며 생명현상을 추진하는 영적<br />
6) Hugo von Hofmannsthal: Ein Brief (Brief des Lord Chandos an Francis Bacon), 1902.
<strong>의</strong> 존엄을 회복하는 것을 자신들<strong>의</strong> 제일<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제로 설정하게 된다. <strong>그리고</strong> 이 <strong>과</strong><br />
제는 눈부시게 발전한 <strong>과</strong>학<strong>과</strong> <strong>과</strong>학<strong>의</strong> 도구인 오성 Verstand으로 해결할 수 있는<br />
문제가 아니었다. 위기<strong>의</strong>식<strong>의</strong> 중심에 생명이 있으며, 생명현상은 <strong>과</strong>학적으로 설<br />
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상상<strong>과</strong> 직관으로 진<br />
실을 포착하는 시인/작가들이 짊어져야 할 일이었다.<br />
그러나 문학은 곧 난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문학<strong>의</strong> 수단은 불완전한 것인데도<br />
그것을 가지고 신비<strong>의</strong> 현상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시대<strong>의</strong> 작<br />
가들은 신비<strong>의</strong> 생명현상을 불완전한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불가능<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제를 떠<br />
맡게 되었다. 그것이 호프만스탈<strong>의</strong> 샨도스 편지 6)에 대변된 당시<strong>의</strong> 언어회<strong>의</strong><strong>의</strong><br />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strong>과</strong>제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고, 새<br />
로운 언어를 얻기 위해서는 끝없는 실험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식다원주<strong>의</strong><br />
는 여기에 기인한다.<br />
일반적인 <strong>의</strong>미에서 <strong>생철학</strong>은 우리 삶<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와 가치, 목적을 관념적이고 이론<br />
적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실존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하지<br />
만 철학적 경향으로서<strong>의</strong> <strong>생철학</strong>은 특히 19세기 후반<strong>과</strong> 20세기 초 독일<strong>과</strong> 프랑스<br />
에서 사상적 흐름을 주도했던 생명 중시 운동을 말한다. 시대<strong>의</strong> <strong>과</strong>학적 경향에<br />
대항하여 일어난 이 운동은 무엇보다 계몽주<strong>의</strong> 합리성 중시에 반발하여 일어난<br />
18세기 슈트름운트드랑 Sturm und Drang<strong>의</strong> 흐름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br />
살아있는 것<strong>과</strong> 죽은 것, 구체적인 것<strong>과</strong> 추상적인 것, 유기적인 것<strong>과</strong> 기계적인<br />
것, 동적인 것<strong>과</strong> 정적인 것을 대립시켜 전자를 후자들<strong>의</strong> 우위에 두었던 이 경향<br />
은 이상주<strong>의</strong> 철학<strong>과</strong> 삶, 시와 사상을 통합하려는 낭만주<strong>의</strong>로 이어졌다. 그러나<br />
<strong>생철학</strong><strong>의</strong> 직접적인 출발은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와 니체 Friedrich<br />
Nietzsche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것은 베르그송 Henri Bergson<strong>과</strong> 딜타이<br />
Wilhelm Dilthey, <strong>그리고</strong> 그들 동시대<strong>의</strong> 많은 철학자들이었다.<br />
<strong>생철학</strong>은 물질세계에 우선하여 살아있는 생명<strong>과</strong> 실제로 체험하는 삶에 중심<br />
을 두는데, 이 중심이 되는 생명<strong>의</strong> 성격은 베르그송<strong>의</strong> 개념 ‘élan vital’에 잘 함<br />
축되어 있다. 이것은 “존재<strong>의</strong> 모든 영역을 통괄하며 생명현상을 추진하는 영적<br />
6) Hugo von Hofmannsthal: Ein Brief (Brief des Lord Chandos an Francis Bacon), 1902.
는 초인을 기대하는 니체가 전자<strong>의</strong>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짐멜<br />
Georg Simmel, 클라게스 Ludwig Klages, 슈펭글러 Oswald Spengler 등은 후자에<br />
속한다. 하웁트만이 니체와<strong>의</strong> 연관성을 단호히 부인하는 것은 그<strong>의</strong> 생각이 후자<br />
들<strong>의</strong> 생각<strong>과</strong> 유사하기 때문이다. 9) 이들에게는 육체 Leib와 영혼 Seele은 분리할<br />
수 없는 생명<strong>의</strong> 두 요소인데 반하여 정신 Geist은 그 둘 사이를 쐐기처럼 갈라놓<br />
아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이다. 정신에 <strong>의</strong>해 영향을 받지 않은 온전한 영혼은 세<br />
계와 삶을 이미지로,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반면, 정신은 생명<strong>의</strong> 지속적인 현상<br />
을 작은 조각들로 쪼개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br />
III. <strong>하웁트만<strong>의</strong></strong> 세계관<strong>과</strong> 문학<strong>의</strong> 성격<br />
하웁트만이 자연주<strong>의</strong> 작품뿐 아니라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strong>의</strong> 동화나<br />
신화와 같은 작품, 심지어는 하나<strong>의</strong> 작품에 서로 대립적인 경향들이 결합된 작<br />
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해가 쉬<br />
워진다. 방법론적 다원성이 그 개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strong>의</strong> 다<br />
양한 양식<strong>의</strong> 작품들은 실증적인 것 뒤에 있을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다<br />
양한 시각<strong>의</strong> 발현인 셈이다. 그는 이미 자연주<strong>의</strong> 시기인 1894년<strong>의</strong> 한 인터뷰에<br />
서 “작가는 언제나 인간<strong>과</strong>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는 방식에 따라 표현<br />
할 수밖에 없다 Der Dichter wird Menschen und Dinge immer nur darstellen können<br />
nicht wie sie sind, sondern wie er sie sieht.” 10)고 말한다. 물론 그 다양성<strong>의</strong> 밑바탕<br />
에는 생명은 자연<strong>과</strong>학적 관찰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strong>생철학</strong>적 세계<br />
관이 일관되게 놓여있다.<br />
실증적인 것 뒤에 근원적인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는 초인을 기대하는 니체가 전자<strong>의</strong>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짐멜<br />
Georg Simmel, 클라게스 Ludwig Klages, 슈펭글러 Oswald Spengler 등은 후자에<br />
속한다. 하웁트만이 니체와<strong>의</strong> 연관성을 단호히 부인하는 것은 그<strong>의</strong> 생각이 후자<br />
들<strong>의</strong> 생각<strong>과</strong> 유사하기 때문이다. 9) 이들에게는 육체 Leib와 영혼 Seele은 분리할<br />
수 없는 생명<strong>의</strong> 두 요소인데 반하여 정신 Geist은 그 둘 사이를 쐐기처럼 갈라놓<br />
아 생명을 파괴하는 요소이다. 정신에 <strong>의</strong>해 영향을 받지 않은 온전한 영혼은 세<br />
계와 삶을 이미지로,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반면, 정신은 생명<strong>의</strong> 지속적인 현상<br />
을 작은 조각들로 쪼개서 생명을 파괴하는 힘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br />
III. <strong>하웁트만<strong>의</strong></strong> 세계관<strong>과</strong> 문학<strong>의</strong> 성격<br />
하웁트만이 자연주<strong>의</strong> 작품뿐 아니라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strong>의</strong> 동화나<br />
신화와 같은 작품, 심지어는 하나<strong>의</strong> 작품에 서로 대립적인 경향들이 결합된 작<br />
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시대적, 사상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해가 쉬<br />
워진다. 방법론적 다원성이 그 개인에게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strong>의</strong> 다<br />
양한 양식<strong>의</strong> 작품들은 실증적인 것 뒤에 있을 보다 근원적인 것을 추구하는 다<br />
양한 시각<strong>의</strong> 발현인 셈이다. 그는 이미 자연주<strong>의</strong> 시기인 1894년<strong>의</strong> 한 인터뷰에<br />
서 “작가는 언제나 인간<strong>과</strong> 사물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는 방식에 따라 표현<br />
할 수밖에 없다 Der Dichter wird Menschen und Dinge immer nur darstellen können<br />
nicht wie sie sind, sondern wie er sie sieht.” 10)고 말한다. 물론 그 다양성<strong>의</strong> 밑바탕<br />
에는 생명은 자연<strong>과</strong>학적 관찰로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strong>생철학</strong>적 세계<br />
관이 일관되게 놓여있다.<br />
실증적인 것 뒤에 근원적인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다. 무당벌레가 감각하지 못하는 우리<strong>의</strong> 존재가 현실<strong>의</strong> 일부이듯이 우리<strong>의</strong> 감각<br />
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세계 역시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당<br />
벌레와 마찬가지로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br />
진짜 세계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br />
많은 작가들이 그랬듯 하웁트만도 자신<strong>의</strong> 세계관이나 예술관을 체계 있게 이<br />
론적으로 기술해 놓지 않았다. 비제 Benno von Wiese는 1922년에 발표된
다. 무당벌레가 감각하지 못하는 우리<strong>의</strong> 존재가 현실<strong>의</strong> 일부이듯이 우리<strong>의</strong> 감각<br />
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세계 역시 현실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당<br />
벌레와 마찬가지로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br />
진짜 세계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문제가 된다.<br />
많은 작가들이 그랬듯 하웁트만도 자신<strong>의</strong> 세계관이나 예술관을 체계 있게 이<br />
론적으로 기술해 놓지 않았다. 비제 Benno von Wiese는 1922년에 발표된
1937년 1월, 베를린 국립극장에서<strong>의</strong> 공연 후에 작품<strong>의</strong> 소재가 드라마에 적합하<br />
지 않다는 비평이 나온 것에 대해 하웁트만이 쓴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발표되<br />
지는 않았고 그 사후에야 공개되었다.<br />
이런 <strong>의</strong>미에서 마흔세 살<strong>의</strong> 남자가 열일곱 살<strong>의</strong> 소녀에게 넋이 빠지게 된다고 생각<br />
해보자. 이미 매인 몸인 그 남자는 자신<strong>의</strong> 열정에 대항한다는 생각으로 이 열정을<br />
다루었다. 그는 열정<strong>의</strong> 대상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대상에 <strong>의</strong>해 소유되기를 원하지<br />
않는다.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작품
1937년 1월, 베를린 국립극장에서<strong>의</strong> 공연 후에 작품<strong>의</strong> 소재가 드라마에 적합하<br />
지 않다는 비평이 나온 것에 대해 하웁트만이 쓴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은 발표되<br />
지는 않았고 그 사후에야 공개되었다.<br />
이런 <strong>의</strong>미에서 마흔세 살<strong>의</strong> 남자가 열일곱 살<strong>의</strong> 소녀에게 넋이 빠지게 된다고 생각<br />
해보자. 이미 매인 몸인 그 남자는 자신<strong>의</strong> 열정에 대항한다는 생각으로 이 열정을<br />
다루었다. 그는 열정<strong>의</strong> 대상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대상에 <strong>의</strong>해 소유되기를 원하지<br />
않는다.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작품
통합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 비극에 머문<br />
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 드라마<strong>의</strong> 영웅전설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작<br />
품<strong>의</strong> 중요한 한 측면을 드러내며, 동시에 동화라는 부제<strong>의</strong> 타당성을 높인다. 그<br />
러나 타학문<strong>의</strong> 이론적 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원래<strong>의</strong> 문학성을 적잖이 손상<br />
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고정적인 <strong>의</strong>미나 이념에 머물지 않으려는 하웁트<br />
만<strong>의</strong> 정신<strong>과</strong>도 거리가 있다.<br />
V. 감각세계<strong>의</strong> 세계극
통합함으로써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실패함으로 인해 비극에 머문<br />
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이 드라마<strong>의</strong> 영웅전설적인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작<br />
품<strong>의</strong> 중요한 한 측면을 드러내며, 동시에 동화라는 부제<strong>의</strong> 타당성을 높인다. 그<br />
러나 타학문<strong>의</strong> 이론적 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원래<strong>의</strong> 문학성을 적잖이 손상<br />
시키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고정적인 <strong>의</strong>미나 이념에 머물지 않으려는 하웁트<br />
만<strong>의</strong> 정신<strong>과</strong>도 거리가 있다.<br />
V. 감각세계<strong>의</strong> 세계극
(314, 315f.). <strong>그리고</strong> 피파를 “작은 정신 klenner Geist”(270, 316)이라 부른다. 27) 이<br />
는 물론 식어가는 난로에 마지막 남은 불꽃인 만큼 <strong>생철학</strong>에서 말하는 세계혼<br />
Weltseele28)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눈 덮인 산 속<strong>의</strong> 춥고 삭막한 세계<strong>의</strong><br />
쇠잔해진 생명이다.<br />
물론 <strong>피파는</strong> <strong>상징</strong>이 아닌, 남성을 매혹하는 구체적 인물이기도 하다. 20세기<br />
로<strong>의</strong> 전환기에 여성은 문명에 덜 물든 존재로 여겨졌고, 여성<strong>과</strong><strong>의</strong> 성애적 결합<br />
은 문명사회와는 멀어진 원초적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br />
되었다. 앞에 언급된 오를로프와<strong>의</strong> 관계에서 보듯 하웁트만도 그랬지만, 순수성<br />
을 잃지 않은 ‘어린 여자 femme-enfant’는 보다 순수한 자연성을 지닌 존재로 숭<br />
배되곤 했다. 산업사회<strong>의</strong> 대변자인 사장이나 짐승<strong>과</strong> 다름없는 원시적 삶을 영위<br />
하는 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방랑하는 헬리겔이 인간으로서 피파를 가까<br />
이 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관조적인 위치로 물러나<br />
현실적 삶<strong>과</strong>는 담을 쌓은 반마저도 그녀에게 매혹되어 냉정함을 잃고 만다.<br />
그러나 사건 전개는 여성을 둘러싼 애정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br />
로 나아가기에 이들에게 <strong>상징</strong>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 특히 3막<br />
에서 사장이 물러간 다음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티로스를 닮은 외양이나 펄펄<br />
끓는 술을 단숨에 마시는 거친 성격 등으로 사장에 <strong>의</strong>해 괴물이라고 불린 훈은<br />
맹목적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자연<strong>의</strong> 힘이다. 그가 1막에서 피파와 추<br />
는, 나약한 생명/피파를 거친 자연<strong>의</strong> 힘/훈이 추적하는 모양<strong>의</strong> 춤은 생명을 향한<br />
그<strong>의</strong> 거친 욕망<strong>의</strong> 표현인 동시에 적대적인 힘 간에 벌어지는 갈등<strong>의</strong> 한 형식이<br />
다. 29) 3막에서야 등장하는 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조적 조감이 가능한 지<br />
혜로운 정신으로서 야수 같은 본능<strong>의</strong> 훈에 대항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 정신도<br />
27)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신은 영혼<strong>의</strong> 대립 요소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strong>의</strong> 정신은 영혼<br />
<strong>과</strong> 동<strong>의</strong>어로 이해해야 한다. 육체나 물질<strong>의</strong> 대립개념으로 정신<strong>과</strong> 영혼은 흔히 혼용되기 때<br />
문이다. 신화에서 나비나 새로 <strong>상징</strong>되는 Psyche가 숨, 호흡, 영혼, 정신, <strong>의</strong>식 등<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를<br />
함께 가지고 있다. <strong>피파는</strong> 이외에도 그림자로도 불리는데 이것 역시 영혼<strong>의</strong> <strong>상징</strong>이다. 죽<br />
은 사람<strong>의</strong> 영혼은 몸이 없으니 그림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br />
28) 자연철학<strong>의</strong> 개념으로, 전체로서<strong>의</strong> 세계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으며 동일한 영혼<br />
에 <strong>의</strong>해 생명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 전체로서<strong>의</strong> 영혼을 말한다.<br />
29) Wolfdietrich Rasch: Tanz als Lebenssymbol im Drama um 1900, in: W. R.: Zur deutschen<br />
Literatur seit der Jahrhundertwende, Stuttgart 1967, S. 75-77.
(314, 315f.). <strong>그리고</strong> 피파를 “작은 정신 klenner Geist”(270, 316)이라 부른다. 27) 이<br />
는 물론 식어가는 난로에 마지막 남은 불꽃인 만큼 <strong>생철학</strong>에서 말하는 세계혼<br />
Weltseele28)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눈 덮인 산 속<strong>의</strong> 춥고 삭막한 세계<strong>의</strong><br />
쇠잔해진 생명이다.<br />
물론 <strong>피파는</strong> <strong>상징</strong>이 아닌, 남성을 매혹하는 구체적 인물이기도 하다. 20세기<br />
로<strong>의</strong> 전환기에 여성은 문명에 덜 물든 존재로 여겨졌고, 여성<strong>과</strong><strong>의</strong> 성애적 결합<br />
은 문명사회와는 멀어진 원초적 자연에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간주<br />
되었다. 앞에 언급된 오를로프와<strong>의</strong> 관계에서 보듯 하웁트만도 그랬지만, 순수성<br />
을 잃지 않은 ‘어린 여자 femme-enfant’는 보다 순수한 자연성을 지닌 존재로 숭<br />
배되곤 했다. 산업사회<strong>의</strong> 대변자인 사장이나 짐승<strong>과</strong> 다름없는 원시적 삶을 영위<br />
하는 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방랑하는 헬리겔이 인간으로서 피파를 가까<br />
이 하려는 것은 그러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관조적인 위치로 물러나<br />
현실적 삶<strong>과</strong>는 담을 쌓은 반마저도 그녀에게 매혹되어 냉정함을 잃고 만다.<br />
그러나 사건 전개는 여성을 둘러싼 애정 관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방향으<br />
로 나아가기에 이들에게 <strong>상징</strong>성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어렵다. 특히 3막<br />
에서 사장이 물러간 다음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티로스를 닮은 외양이나 펄펄<br />
끓는 술을 단숨에 마시는 거친 성격 등으로 사장에 <strong>의</strong>해 괴물이라고 불린 훈은<br />
맹목적으로 생명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자연<strong>의</strong> 힘이다. 그가 1막에서 피파와 추<br />
는, 나약한 생명/피파를 거친 자연<strong>의</strong> 힘/훈이 추적하는 모양<strong>의</strong> 춤은 생명을 향한<br />
그<strong>의</strong> 거친 욕망<strong>의</strong> 표현인 동시에 적대적인 힘 간에 벌어지는 갈등<strong>의</strong> 한 형식이<br />
다. 29) 3막에서야 등장하는 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조적 조감이 가능한 지<br />
혜로운 정신으로서 야수 같은 본능<strong>의</strong> 훈에 대항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 정신도<br />
27) 2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신은 영혼<strong>의</strong> 대립 요소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strong>의</strong> 정신은 영혼<br />
<strong>과</strong> 동<strong>의</strong>어로 이해해야 한다. 육체나 물질<strong>의</strong> 대립개념으로 정신<strong>과</strong> 영혼은 흔히 혼용되기 때<br />
문이다. 신화에서 나비나 새로 <strong>상징</strong>되는 Psyche가 숨, 호흡, 영혼, 정신, <strong>의</strong>식 등<strong>의</strong> <strong>의</strong>미를<br />
함께 가지고 있다. <strong>피파는</strong> 이외에도 그림자로도 불리는데 이것 역시 영혼<strong>의</strong> <strong>상징</strong>이다. 죽<br />
은 사람<strong>의</strong> 영혼은 몸이 없으니 그림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br />
28) 자연철학<strong>의</strong> 개념으로, 전체로서<strong>의</strong> 세계도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으며 동일한 영혼<br />
에 <strong>의</strong>해 생명운동을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이 전체로서<strong>의</strong> 영혼을 말한다.<br />
29) Wolfdietrich Rasch: Tanz als Lebenssymbol im Drama um 1900, in: W. R.: Zur deutschen<br />
Literatur seit der Jahrhundertwende, Stuttgart 1967, S. 75-77.
생명작용<strong>과</strong> 그 신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br />
이러한 해석은 하웁트만이 보는 세계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만이 아니라<br />
상상을 통해 예감하는 세계까지를 포함한 ‘더 높은’ 현실이고, 그것 또한 신비성<br />
을 지니고 있기에
생명작용<strong>과</strong> 그 신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겠다.<br />
이러한 해석은 하웁트만이 보는 세계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세계만이 아니라<br />
상상을 통해 예감하는 세계까지를 포함한 ‘더 높은’ 현실이고, 그것 또한 신비성<br />
을 지니고 있기에
지엔 전설 속<strong>의</strong> 물속으로 사라진 도시 비네타 Vineta34) 등이 혼합된 가상<strong>의</strong> 도<br />
시이다. 발레라는 전설<strong>의</strong> 베네치아인은 “베네치아<strong>의</strong> 물 속 한가운데에 in Vendig<br />
mitten im Wasser”(295) 황금<strong>과</strong> 호박으로 된 궁전, 또는 “땅 내부에 im Innern der<br />
Erde”(295) 황금동굴이나 성을 가지고 있다. 헬리겔은 환상 여행 중에 “깊은 곳<br />
<strong>의</strong> 정원 Gärten der Tiefe”(320) 또는 “돌로 된 von Stein”(307) 정원을 본다. 이러<br />
한 것들로 판단하건대 베네치아는 실제<strong>의</strong> 베네치아가 아니라 물 속이나 땅 속<br />
깊은 곳, 감각<strong>의</strong> 저편에 존재하는 신비<strong>의</strong> 나라이다.<br />
이제 문제는 헬리겔이 <strong>과</strong>연 신비<strong>의</strong> 나라 베네치아에 도달할 수 있는가이다.<br />
뮬헤어는 그것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비교<strong>의</strong> 입교식<strong>과</strong> 같은 <strong>과</strong>정을 거쳐서<br />
실현되고 있다고 말한다. 35) 입교식은 비교<strong>의</strong> 신도 Myste가 되려는 일정한 <strong>의</strong>식<br />
Misterium <strong>과</strong>정에 지원자가 황홀경인 엑스타제 Ekstase 속에서 신을 알현하게 되<br />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에 안내하는 스승 Mystagogos이 필요하다. 그러니까<br />
헬리겔은 반<strong>의</strong> 안내로 비<strong>의</strong>를 거쳐 이상향 베네치아에 도달하게 된다.<br />
이 <strong>과</strong>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영혼이 출발해서, 몸에서 영혼이<br />
빠져나오는 자기파괴 <strong>과</strong>정을 거쳐, 엑스타제<strong>의</strong> 직전에서 기쁨<strong>과</strong> 슬픔<strong>과</strong> 같은 온<br />
갖 모순된 감정을 경악 속에서 일시에 체험하고, 드디어 신을 알현하는 상태에<br />
도달하게 된다. 헬리겔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은 훈이 “유말라이!!!<br />
Jumalaï!!!”(318) 36)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파와 함께 죽을 때이다. 이때에 헬리겔<br />
은 피파<strong>의</strong> 양어깨에 촛불이 광배처럼 비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37)<br />
헬리겔이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에 피파가 죽는 데도 그것을 못보고 그녀<strong>의</strong><br />
광배를 보는 것도 그가 다른 차원<strong>의</strong> 세계에 도달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 된다. 눈<br />
이 멀게 되는 것은 앞<strong>의</strong> 무당벌레 인용 직전에 반이 사장에게 “당신네가 그것을<br />
듣게 되면 귀가 멀고 말 거요. Trifft es euch, so seid ihr taub.”(296)란 말에서 이<br />
33) 한 예가 만 Thomas Mann<strong>의</strong>
지엔 전설 속<strong>의</strong> 물속으로 사라진 도시 비네타 Vineta34) 등이 혼합된 가상<strong>의</strong> 도<br />
시이다. 발레라는 전설<strong>의</strong> 베네치아인은 “베네치아<strong>의</strong> 물 속 한가운데에 in Vendig<br />
mitten im Wasser”(295) 황금<strong>과</strong> 호박으로 된 궁전, 또는 “땅 내부에 im Innern der<br />
Erde”(295) 황금동굴이나 성을 가지고 있다. 헬리겔은 환상 여행 중에 “깊은 곳<br />
<strong>의</strong> 정원 Gärten der Tiefe”(320) 또는 “돌로 된 von Stein”(307) 정원을 본다. 이러<br />
한 것들로 판단하건대 베네치아는 실제<strong>의</strong> 베네치아가 아니라 물 속이나 땅 속<br />
깊은 곳, 감각<strong>의</strong> 저편에 존재하는 신비<strong>의</strong> 나라이다.<br />
이제 문제는 헬리겔이 <strong>과</strong>연 신비<strong>의</strong> 나라 베네치아에 도달할 수 있는가이다.<br />
뮬헤어는 그것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비교<strong>의</strong> 입교식<strong>과</strong> 같은 <strong>과</strong>정을 거쳐서<br />
실현되고 있다고 말한다. 35) 입교식은 비교<strong>의</strong> 신도 Myste가 되려는 일정한 <strong>의</strong>식<br />
Misterium <strong>과</strong>정에 지원자가 황홀경인 엑스타제 Ekstase 속에서 신을 알현하게 되<br />
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때에 안내하는 스승 Mystagogos이 필요하다. 그러니까<br />
헬리겔은 반<strong>의</strong> 안내로 비<strong>의</strong>를 거쳐 이상향 베네치아에 도달하게 된다.<br />
이 <strong>과</strong>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우선 영혼이 출발해서, 몸에서 영혼이<br />
빠져나오는 자기파괴 <strong>과</strong>정을 거쳐, 엑스타제<strong>의</strong> 직전에서 기쁨<strong>과</strong> 슬픔<strong>과</strong> 같은 온<br />
갖 모순된 감정을 경악 속에서 일시에 체험하고, 드디어 신을 알현하는 상태에<br />
도달하게 된다. 헬리겔이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순간은 훈이 “유말라이!!!<br />
Jumalaï!!!”(318) 36)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파와 함께 죽을 때이다. 이때에 헬리겔<br />
은 피파<strong>의</strong> 양어깨에 촛불이 광배처럼 비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37)<br />
헬리겔이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에 피파가 죽는 데도 그것을 못보고 그녀<strong>의</strong><br />
광배를 보는 것도 그가 다른 차원<strong>의</strong> 세계에 도달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 된다. 눈<br />
이 멀게 되는 것은 앞<strong>의</strong> 무당벌레 인용 직전에 반이 사장에게 “당신네가 그것을<br />
듣게 되면 귀가 멀고 말 거요. Trifft es euch, so seid ihr taub.”(296)란 말에서 이<br />
33) 한 예가 만 Thomas Mann<strong>의</strong>
리고 훈<strong>과</strong> 피파<strong>의</strong> 추적<strong>과</strong> 도피, 그들<strong>의</strong> 춤, 헬리겔<strong>의</strong> 눈멂 등 행위와 사건도 상<br />
징적 <strong>의</strong>미를 지닌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작품 전체가 <strong>상징</strong>이기도 하다.<br />
작품
리고 훈<strong>과</strong> 피파<strong>의</strong> 추적<strong>과</strong> 도피, 그들<strong>의</strong> 춤, 헬리겔<strong>의</strong> 눈멂 등 행위와 사건도 상<br />
징적 <strong>의</strong>미를 지닌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작품 전체가 <strong>상징</strong>이기도 하다.<br />
작품
1981.<br />
Wiese, Benno von: Gerhart Hauptmann, in: B. v. W. (Hg.): Deutsche Dichter der<br />
Moderne, Berlin: Schmidt 1975.
1981.<br />
Wiese, Benno von: Gerhart Hauptmann, in: B. v. W. (Hg.): Deutsche Dichter der<br />
Moderne, Berlin: Schmidt 1975.
entfalten.<br />
Da das Drama rätselhafte Geheimnisse des Lebens durch Sinnbilder darstellt, ist es<br />
unmöglich und auch nicht ratsam, dass man darin eine eindeutige Bedeutung des<br />
Werkes herauszufinden versucht. Besser wäre es, dass man durch die Lektüre oder<br />
Aufführung das Stück selbst sprechen lässt und dabei die rational unfassbaren<br />
Geheimnisse des Lebens ahnt und bewund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