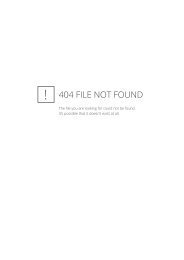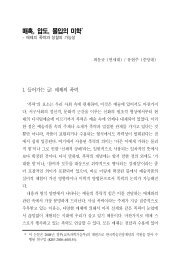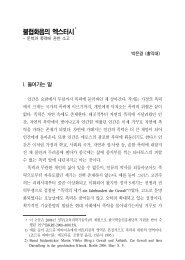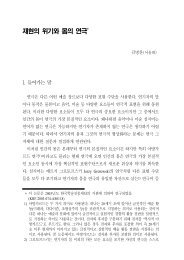Down - 한국뷔히너학회
Down - 한국뷔히너학회
Down - 한국뷔히너학회
Erfolgreiche ePaper selbst erstellen
Machen Sie aus Ihren PDF Publikationen ein blätterbares Flipbook mit unserer einzigartigen Google optimierten e-Paper Software.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 *<br />
— 엘프리데 옐리넥의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을 중심으로<br />
Ⅰ. 들어가며<br />
박은주 (연세대)<br />
이 연구의 목적은 문학에서 타자성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흡혈귀 모티<br />
브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 주제는 지난 세기말 이후 철학이나 문화 전반에<br />
서 부상한 이질적인 것과 타자에 대한 관심과 맥을 같이 한다. 가령 현대 미술은<br />
온갖 괴물 형상의 서식처가 되고 있고, 1) 만화나 영화와 같은 영상매체들에서는<br />
악마, 유령, 흡혈귀, 괴물 등 온갖 기괴한 형상들이 출몰한다. 2) 또한 이성과 주체<br />
중심의 현대를 비판하는 탈현대의 사유는 자아와 타자를 가르는 경계가 얼마나<br />
모호한지, 그것이 어떻게 권력 작용에 의해 구성되는지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br />
그 동안 주류 담론에서 주변부로 밀려났던 ‘타자성’의 문제는 또한 현 시대가 요<br />
청하는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실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제이기도 하다. 왜<br />
냐하면 타자성의 개념과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자아와 타자 간의 관계를 규정<br />
지을 것이며, 이것은 곧 타자와의 소통 방식을 규정짓고 인류 문화 및 세계의 미<br />
래상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br />
하지만 이러한 타자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달리 세계 곳곳에는 여전히 이질적<br />
인 것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타자를 적대시하고 경계 너머로 내<br />
쫓으면서 자아나 집단,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들이 도처에 존재한다.<br />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br />
행된 연구임(KRF-2006-321-A01140).<br />
1) 이신영: 경계 위의 존재 - 괴물의 미학, 실린 곳: 미술세계, 통권 181호(1999.12월) 참조.<br />
2) 우리나라에서는 일례로 2006년에 상영된 과 작년에 개봉되었던 등을 들 수<br />
있다.
3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이는 물론 근대 이후 서구의 이성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현대<br />
계몽주의 철학은 코기토에 기반한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확신에서 한편으론 타<br />
자를 동일자 속에 흡수, 동화시킴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했고, 또 한편<br />
으론 타자를 억압하는 동시에 배제하고 감금하는 동시에 경계 밖으로 내쫓았다.<br />
인간이 타자로 상상해온 것은 포괄적인 범주에서 보면 이방인, 신 그리고 괴<br />
물을 들 수 있는데, 3) 본 연구에서는 문학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끌어 온 흡혈귀<br />
모티브에 주목하고자 한다. 타자의 형상으로서 흡혈귀는 문학뿐만 아니라 드라<br />
마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매체와 회화 등 시각 예술에서도 ‘타자성’을 드러내는<br />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어 왔다. 흡혈귀 모티브는 특히 브람 스토커 Bram Stoker<br />
의 소설 드라큘라(1897)와 영화 시리즈들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다.<br />
한편 독일문학에서는 70년대 이후 흡혈귀 모티브를 새로운 시각에서 문학적으<br />
로 형상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4) 이는 그 모티브의 창조적 변형 가능성<br />
에서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흡혈귀 모티브는 오늘날에도 그것의 문학적 가공을<br />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이미 자신 안에 갖고 있거나 또 새롭게 수용할<br />
수 있으며, 5) 이러한 잠재적인 다의성을 토대로 흡혈귀 모티브와 문화적이고 미<br />
학적인 문제제기들이 새로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br />
는 옐리넥의 흡혈귀 서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옐리넥은 희곡 질병 혹은<br />
현대 여성들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1987)에서 흡혈귀 모티브를 이른바<br />
“남성 지배의 문화 속에서 여성적인 것과 여성 예술가의 불완전한 실존에 대한<br />
은유” 6)로 사용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 여성 흡혈귀는 상호텍스트적 서술을 통해<br />
서구 문화사의 다양한 타자성의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br />
3) 리처드 커니(이지영 옮김):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원<br />
2004 참조.<br />
4) 이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엘프리데 옐리넥의 질병 혹은 현대여성들 (1987)과 아돌프 무<br />
슉 Adolf Muschg의 빛과 열쇠 - 어느 흡혈귀의 교육소설(1984)이 있다. Vgl. Susanne<br />
Pütz: Vampire und ihre Opfer. Der Blutsauger als literarische Figur, Bielefeld 1992, S. 30.<br />
5) Vgl. ebd. S. 12. 이 책에서 퓌츠는 흡혈귀 형상이 지닌 다의성과 변화무쌍함, 즉 그 모티브<br />
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주제의 다의성 Polyvalenz<br />
des Sujets”에 주목하고 있다.<br />
6) Oliver Claes: Fremde. Vampire. Sexualität, Tod und Kunst bei Elfriede Jelinek und Adolf<br />
Muschg, Bielefeld 1994, S. 30.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35<br />
우선 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바 없는 흡혈귀 모티브에 관해 살<br />
펴보고자 한다. 특히 흡혈귀가 단순한 민간신앙에서 적대적인 투사상으로 변화<br />
되는 과정과 흡혈귀 모티브에 얽혀 들어간 다양한 의미들을 고찰하겠다. 다음으<br />
로는 옐리넥의 흡혈귀 모티브가 구현하고 있는 타자성의 특징을 전통적인 여성<br />
성 담론 및 예술이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는 옐리넥에게서 문학<br />
적으로 형상화된 타자성이 최근의 윤리적, 실천철학적 타자성 논의의 맥락에서<br />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성찰해보고자 한다. 이는 옐리넥의 흡혈귀 서사가 현<br />
실적, 실천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지점을 가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br />
Ⅱ. 흡혈귀 모티브의 문화사적 배경과 다양한 의미망<br />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br />
볼 때 정체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타자의<br />
개념도 변화되어왔다. 이처럼 정체성과 타자성은 서로의 경계가 변화되는 상대<br />
적인 개념이며, 흡혈귀 모티브의 역사는 이와 같은 경계들을 가시화한다. 정체<br />
성의 역사는 타자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는 회피전략으로 타자를 문화적 무의식<br />
의 영역으로 내쫓고 억압했는데, 흡혈귀는 이러한 문화적 무의식을 구현하는 환<br />
상적 형상으로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흡혈귀 형<br />
상은 일종의 문화학적 패러다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7) 그 이유는 문화적으로<br />
주변화 되고 억압된 것의 복귀를 표현하는 흡혈귀 형상을 통해 인간의 욕구를<br />
둘러싼 대립과 갈등을 비롯해서 그 시대의 다양한 문화적 담론들을 읽어낼 수<br />
있기 때문이다. 또한 흡혈귀 형상은 동일시와 타자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변화하<br />
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상호텍스트적이고 상호문화적인 의미 다양성을 드러낸<br />
다.<br />
이런 흡혈귀의 존재가 유럽에서 문화적으로 자리 잡게 되기까지는 여러 전유<br />
7) Vgl. Julia Bertschik/Christa A. Tuczay: Poetische Wiedergänger. Einleitung, in: Dies.(Hg.):<br />
Poetische Wiedergänger. Deutschsprachige Vampirismus-Diskurse vom Mittelalter bis zur<br />
Gegenwart, Tübingen 2005, S. 7-10, hier S. 7.
3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의 단계를 거쳤다. 시초에는 민속적이고 신화적인 민간신앙으로 시작된 흡혈귀<br />
주의는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흡혈귀의 존재가 기록으로 증명되고 신학, 철학,<br />
의학 등 학문적으로 연구되기에 이르렀다. 흡혈귀에 대한 문학적 형상화는 학문<br />
적 논의보다 훨씬 뒤늦은 1800년경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는 아마도 계몽주<br />
의와 바이마르 고전주의의 합리적 경향이 이른바 ‘미신’을 문학화하기를 거부했<br />
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거부적 태도는 낭만주의에 와서 소위 고급스럽지<br />
않은 ‘민간 전통’에 눈을 돌리면서 비로소 변화된다. 흡혈귀가 문화적으로 전유<br />
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흡혈귀가 영화, 일상 문화, 광고 등의 대중 매체 그리고<br />
괴기스런 고딕풍의 하위문화에서 빈번하게 등장한다. 8) 한편 흡혈귀 모티브의<br />
기능과 의미가 문화사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도 흡혈귀에 관한 신화나<br />
민간 전설, 소설과 영화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 우선 흡혈<br />
귀는 다른 이의 신선한 피를 공급받는다― 즉 다른 이에게 기생한다 ―는 조건<br />
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 그는 극단적인 대립 사이를 넘나들며 양자<br />
를 지양하는 ‘중간자’로서 산 자의 문명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월경하는 자이<br />
다. 이처럼 ‘살아있는 죽은 자 Un-tote’인 흡혈귀 형상은 따라서 그 자체로 ‘비정<br />
상적인 아웃사이더’이자 모호한 정체성을 지닌 ‘불확정적인 기호’로서, 문화적<br />
기억 속에서 문화적인 경계들 너머에 존재하는 ‘타자 내지 비합리적인 것의 빈<br />
자리’를 예약해두고 있다. 9) 요컨대 흡혈귀는 인간의 자연 지배와 질서 의식의<br />
8) 흡혈귀에 대한 민속적이고 신화적인 전유 단계에서는 슬라브족의 영향 하에 있던 동유럽<br />
지역에서 고대 악령학의 잔재들이 토착적인 요소들과 결합하여 흡혈귀에 대한 담론이 만<br />
들어졌다. 20세기까지도 지속되는 이 민간신앙은 흔히 집단 히스테리의 형태를 띨 수 있는<br />
전염병이나 위기상황의 맥락에서 나타난다. 18세기 중반 이후 출판과 학문을 통해 전유되<br />
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흡혈귀의 존재가 기록으로 증명되는데, 이는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br />
에 의해 통치되었던 동유럽의 변경지역인 세르비아, 메렌, 쉴레지엔의 역사적 사건들에서<br />
비롯되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키솔로바와 메드베기아의 마을들에서 일어난 사건(1725<br />
년/32년)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죽은 자들에게 쫓기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을 계기로 무덤<br />
을 파헤치게 되었다. 무덤훼손과 마을 주민들의 집단적인 대탈출사건은 공공질서를 크게<br />
흔들어놓았고 오스트리아 군 당국에 의해 사실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당시에 생겨난<br />
‘X파일’은 독일어로 된 간행물을 통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다. Vgl. Clemens<br />
Ruthner: Dämon des Geschlechts. Prolegomena zu Vampirismus und Gender in der neueren<br />
deutschsprachigen Literatur, in: Ivanovic' Christine/Jürgen Lehmann/Markus May(Hg.):<br />
Phantastik - Kult oder Kultur? Aspekte eines Phänomens in Kunst, Literatur und Film,<br />
Stuttgart 2003, S. 215-238, hier S. 217f.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37<br />
저편에서 균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타자의 형상으로서 형상화되어 왔다. 10)<br />
흡혈귀 모티브의 문화사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애초에 이교적인 민간신앙이<br />
었던 흡혈귀주의가 점차 종교나 사회심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적대적인 타자 생<br />
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자연법칙의 위반자이기는 하지만 주변<br />
적인 아웃사이더에 불과했던 흡혈귀가 적대적인 타자의 형상이 된 데에는 기독<br />
교의 역할이 컸다. 이교적인 미신에서는 흡혈귀가 되는 이유들이 대부분 우연적<br />
이고 죄와 상관없는 부당한 것이었던 반면, 기독교는 흡혈귀 형상을 악마화하고<br />
타자화하여 기독교의 법을 어기는 등의 범법자 축출의 근거로 이용했다. 11) 이제<br />
흡혈귀란 살아생전에 이미 ‘법과 질서의 세계에서 축출당한 채’ 죽은 존재로서,<br />
죽은 자의 사회와 산 자의 사회에서 모두 ‘추방된’ 타자가 된다. 12) 종교적, 도덕<br />
적 차원에서 적대적인 타자의 형상으로 구축된 흡혈귀는 볼테르가 이른바 ‘미<br />
신’에 대항하는 계몽주의적인 투쟁의 의미에서 흡혈귀를 ‘비유적’으로 사용하면<br />
서 13) 그 개념이 사회학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후 인간<br />
을 착취하는 자로서 ‘흡혈귀의 원리’가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했으며, 맑시즘의<br />
9) Vgl. Clemens Ruthner: Untote Verzahnungen. Prolegomena zu einer Literaturgeschichte des<br />
Vampirismus, in: Julia Bertschik/Christa A. Tuczay(Hg.): Poetische Wiedergänger. Deutsch-<br />
sprachige Vampirismus-Diskurs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 Tübingen 2005, S.<br />
11-41, hier S. 15.<br />
10) 이런 맥락에서 흡혈귀 모티브와 관련하여 합리성과 신화, 계몽과 미신의 관계가 주된 문제<br />
로 제기되며 이와 더불어 인간의 자연지배에 대한 욕망과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무<br />
의식적인 불안과 공포가 들추어진다.<br />
11)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발칸지역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그 지역에 팽배하던 흡혈귀에 대<br />
한 민중의 두려움을 이용했고 흡혈귀를 영혼의 치유를 위협하는 악마와 결탁한 자로 선언<br />
했다. 기독교의 팽창과 더불어 흡혈귀는 이교적인 환경 속에서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br />
형성된 무서운 형상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악마화되고, 도덕적인 의미를 지닌 경고의 표시<br />
로서 기독교적 맥락 속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중세에는 흡혈귀가 용서받지 못한 채 죽은<br />
죄인이거나 교회에서 파문당한 존재로, 또 악마와 결탁한 자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여기에<br />
속하는 인물군은 비정상적인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마술사나 예언가 같은 사람들이었다.<br />
Vgl. Susanne Pütz: a.a.O., S. 16ff.<br />
12) 이 전설의 기원을 이루는 흡혈귀가 동유럽의 변방 출신으로서 서유럽의 계몽주의적 공론<br />
장에서 이미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타자’로서 등장한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심<br />
장하다. 클로드 르쿠퇴(이선형 옮김): 뱀파이어의 역사 푸른미디어 2002, 14쪽 이하와<br />
250쪽 이하 참조.<br />
13) 볼테르는 백과사전에 흡혈귀라는 표제어를 채택하면서 ‘진짜 흡혈귀는 왕들과 민중의<br />
희생으로 먹고 사는 성직자들’이라고 표현했다.
3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담론에서는 자본 자체가 노동을 착취하는 흡혈귀로 비유되면서 흡혈귀주의는<br />
사회비판적인 메타포로 옮겨갔다. 14) 그리고 흡혈귀의 비유적 사용과 병행하여<br />
흡혈귀주의에서는 점차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집단적이고 대중적인 투사가 광범<br />
위하게 작동하게 되었다. 15)<br />
흡혈귀 형상에 대한 이와 같은 다의적인 해석을 배경으로 문학에서는 흡혈귀<br />
모티브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망과 주제들을 생산해 냈다. 그 중에서 특히 범례<br />
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질병, 죽음과 영생, 사랑과 성, 권력과 적에 대한 공포에<br />
대한 사고와 상상의 이미지들이다. 흡혈귀 모티브는 무엇보다도 흡혈귀와 그 희<br />
생자 간의 권력의 격차와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경제적 혹은 정서적인 착취(내<br />
지 기생)와 희생, 식민주의적 정복자와 피지배자의 관계(혹은 그것의 전도된 형<br />
태)를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요컨대 문학에서의 흡혈귀는<br />
대부분의 괴물 서사와 마찬가지로 적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br />
행하곤 했는데, 이런 흡혈귀 서사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타자를 생산하는 방<br />
식, 즉 양가적인 내면의 느낌들을 외부의 대상에게 전이하는 ‘투사’라는 방어기<br />
제에 따른 타자 생산의 방식이 가시화된다. 16) 가령 브람 스토커의 소설 드라큘<br />
라는 침략자 내지 식민주의적 지배자가 역으로 피식민지배자로부터 침략을 당<br />
할지도 모른다는 전도된 불안과 공포를 흡혈귀 모티브에 투사하여 타자를 만들<br />
14) Vgl. Clemens Ruthner: Untote Verzahnungen, S. 26ff.<br />
15) 이러한 집단적 투사의 경향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선동이나 나치즘과 흡혈귀주의의 연관에<br />
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나치즘적인 담론에서 피에 대한 흡혈귀의 열광은 유토피아적<br />
인 민족 부활의 담론으로 가치전도 되어 흡혈귀는 집단적인 적의 이미지에서 집단적인 동<br />
일시의 형상으로 역전되기도 한다. 현대에서 집단적인 동일시로의 이러한 전환은 베르너<br />
헤어촉의 영화 (1978)에서 나타나는 나치부상과 연결된 흡혈귀주의의 알레고<br />
리에서 확실히 포착된다. Vgl. Laurence Rickels: Warum Vampirismus? Die Darstellung<br />
oder Bestattung des Anderen vom Phantasma bis zum Film, in: Theorie der Alterität.<br />
München 1991. S. 158-166.(Akten des VI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Tokyo<br />
1990. 11. Bd. 2), hier S. 163.<br />
16) Vgl. Sigmund Freud: Totem und Tabu. Gesammelte Werke Bd. 9. Hg. v. Anna Freud u. a.,<br />
Frankfurt a. M. 1978, S. 113f.(“Animismus, Magie und Allmacht der Gedanken” 중에서) 이<br />
때 흡혈귀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부도덕한 욕망과 욕구 및 그에 대한 죄의식과 혐오의 양<br />
가감정 사이에서 진동하면서 적대적인 타자와 동일시의 경계를 넘나든다. 흡혈귀 모티브<br />
에 대한 심리학적인 해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책을 참조. Vgl. Susanne Pütz:<br />
a.a.O., S. 19ff.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39<br />
어 낸 대표적인 예이다. 17) 이런 예는 흡혈귀 모티브를 통해 투사된 다양한 타자<br />
의 모습들, 가령 유대인이나 18) 다른 계급과 다른 인종, 다른 성 내지 이성애와는<br />
다른 성관계 등의 형상화로 변형되어 나타났다.<br />
흡혈귀 모티브가 불러일으키는 관념에는 또한 전염병과 감염의 개념이 포함<br />
되었는데, 이는 중세에 페스트나 다른 질병이 ‘해로운 죽은 자들’로부터 기인하<br />
는 것으로 간주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해로운 죽은 자에 대한 미신은 전염병<br />
이 돌 때 더욱 강화되며, 20세기에조차도 전염병이 돌 때 무덤을 파헤치는 사건<br />
이 일어났다. 흡혈귀와 질병의 연관은 또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는데,<br />
그들은 썩지 않고 여전히 핏기가 있는 듯한 시체 - 사람들은 이런 시체가 낮에<br />
흡혈귀로 활동한다고 믿었다 - 의 현상을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맥락에서 포르피<br />
린증이나 광견병 혹은 정신분열증과 연관 지었다. 또한 집단을 위협하는 피에<br />
의한 감염에 대한 공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타나는 인종차별주의적<br />
인 우생학으로부터 현대의 유전공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어쨌든 흡혈귀 모티<br />
브와 질병 내지 병균의 감염을 연관시키는 것은 흡혈귀 서사나 영화 및 연극에<br />
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19)<br />
흡혈귀의 문학적 형상화에서는 또한 그 시초부터 남녀 간의 관계와 성적 욕<br />
망과 죽음이 핵심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다. 18, 19세기의 흡혈귀 서사에서 흡<br />
혈귀와 희생자의 관계는 흔히 남성과 여성간의 에로틱한 사랑의 요소와 함께 묘<br />
사되었다. 최초로 흡혈귀를 등장시키고 있는 1748년의 오센펠더 Ossenfelder의<br />
시나 1797년에 쓰인 괴테의 발라드「코린트의 신부 Die Braut von Korinth」에서<br />
는 모두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망의 문제가 당대의 시민적, 도덕적 배경에서 묘<br />
사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남녀 간에 존재하는 성적 권력 관계와 당대의 도덕적<br />
17) 여기서는 19세기 말의 식민주의의 최고 권력인 영국이 동유럽으로부터 침략을 당할지도<br />
모른다는 공포, 달리 표현하면 외국인이 자국 민족의 피를 오염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공<br />
포를 타자의 형상인 동유럽 트란실바니아 출신인 드라큘라에게 투사하였다.<br />
18) 에버스 Hanns Heinz Ewers의 뱀파이어(1921)에서는 불사의 뱀파이어를 유대인과 동일시<br />
했다. 클로드 르쿠퇴(이선형 옮김): 뱀파이어의 역사, 10쪽 참조.<br />
19)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미국에서 부활한 흡혈귀 영화의 성공 이면에는 동성애자들과 에<br />
이즈 환자들에 의한 피의 감염에 대한 공포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프랜시스 코폴<br />
라 감독의 영화와 앤 라이스의 소설 레스타트가 그 예이다. 레이몬드 맥널<br />
리/라두 플로레스쿠(하연희 옮김): 드라큘라. 그의 이야기, 루비박스 2002, 253쪽 참조.
4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관념과 욕망간의 갈등을 읽어낼 수 있다. 20) 19세기 초반까지 남성 흡혈귀가 대<br />
세였으나 19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그리고 특히 낭만주의가 부상하면서 여성 흡<br />
혈귀로 초점이 이동되었다. 여성성과 흡혈귀는 둘 다 합리적인 질서에 반하는<br />
어떤 것, 즉 계몽주의적 질서의 ‘타자’로 간주되어 동일시되었다. 여성성은 무엇<br />
보다도 죽음이나 악과 같은 부정성 자체와 동일시되었고, 낭만주의는 이러한<br />
‘여성성’을 당대의 문화와 사회의 억압적 조직에 대비시킬 수 있는 비판적 구상<br />
으로 발견해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 흡혈귀뿐 아니라 여성 자체도 ‘죽음과<br />
타자의 장소’, 이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의 장소에 고착화되었다. 21) 19세기 중후<br />
반 이후 여성 흡혈귀의 부상은 낭만주의와 데카당스 사이의 예술에서 여성이 악<br />
마화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며 여성 흡혈귀는 팜므 파탈의 모습으로 나타난<br />
다. 이로써 20세기까지의 여성 흡혈귀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잔인한 팜므<br />
파탈(혹은 요녀)과 창백하고 연약한 여성 희생자의 이분법적인 스테레오 타입으<br />
로 고정된다. 22) 특히 요녀 Vamp의 표상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 이념의 육체적<br />
담지자’로 기능하게 하며, 여기서 남성 집단의 환상은 여성성을 객체화된 상징<br />
으로서 철저히 도식화하고 있다. 23) 이처럼 19세기 여성 흡혈귀의 모습은 남성들<br />
20) 앞의 시에서는 남성인 서정적 자아가 흡혈귀로 등장하여 소녀에게 성적인 사랑을 요구하<br />
며, 괴테의 시에서는 젊은 여성이 흡혈귀로 나타나 자신을 숭배하는 남성으로부터 충동적<br />
사랑과 성적 쾌락에 대한 요구를 받는다. Vgl. Clemens Ruthner: Dämon des Geschlechts,<br />
S. 219. 괴테의 「코린트의 신부」에 관한 또 다른 자세한 해석은, Vgl. Silvia Volkmann:<br />
“Gierig saugt sie seines Mundes Flammen”. Anmerkungen zum Funktionswandel des<br />
weiblichen Vampirs in der Literatur des 19. Jahrhunderts, in: Renate Berger/Inge<br />
Stephan(Hg.): Weiblichkeit und Tod in der Literatur, Köln u. Wien 1987, S. 155-176; Vgl.<br />
Hans Richard Brittnacher: Phantasmen der Niederlage. Über weibliche Vampire und ihre<br />
männlichen Opfer um 1900, in: Julia Bertschik/Christa A. Tuczay(Hg.): a.a.O., S. 163-183.<br />
21) 이러한 낭만주의의 여성성 구상은 그 비판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성 개념을 이<br />
데올로기적인 함정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하였다. Vgl. Silvia Volkmann: a.a.O., S. 165f. 필<br />
자는 이 글에서 19세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여성 흡혈귀의 기능변화에 주목하면서, 여성성<br />
의 담론이 죽음의 담론과 그리고 부정성인 악의 담론과 결합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규<br />
정되고 변화되는 역사적 추이를 추적했다. 필자는 애초에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흡<br />
혈귀가 여성적’이라는 관념이 이 시기에 ‘여성은 곧 흡혈귀다’라는 정의로 변화되었다고<br />
분석했다.<br />
22) Vgl. Clemens Ruthner: Dämon des Geschlechts, S. 221.<br />
23) Vgl. Corina Caduff: Ich gedeihe inmitten von Seuchen. Elfriede Jelinek-Theatertexte, Bern<br />
u.a. 1991, S. 127ff.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41<br />
에 의해 생산된 여성성의 표상들로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과 불안이 투사<br />
된 결과이다. 24) 따라서 흡혈귀 서사의 여성성 이미지는 인위적이고 상상된 것으<br />
로,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부정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br />
남성에 의해 규정된 이 여성상은 여성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끼쳐 여성을 이<br />
이미지에 “예속된 자인 동시에 제외된 타자” 25)로 경험하게 했다. 19세기에 남성<br />
들의 문학이 흡혈귀를 통해 적의 이미지를 표출한다면, 20세기 중후반에는 대개<br />
여성들의 문학이 자의식을 가지고 여성 흡혈귀를 등장시킨다. 특히 80년대 말<br />
이후 흡혈귀주의는 추구할만하거나 혹은 고통으로 다가오는 아웃사이더적 존재<br />
에 대한 메타포로 투입된다. 이로써 흡혈귀 모티브는 ― 특히 여성 작가에게 있<br />
어서 ― ‘성역할 내지 정체성 추구에 관한 근거 묻기’에 이용된다. 26)<br />
Ⅲ. 옐리넥 작품의 흡혈귀 모티브<br />
옐리넥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배적인 원칙이나 파시즘과 같이 억압되어<br />
있던 역사적 현상의 복귀, 가족 간의 종속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권력 행사나 성<br />
관계의 법칙 등 다양한 의미망 속에서 흡혈귀 모티브를 가공하면서 이 모티브가<br />
지닌 기존의 범례들과 상투성을 파괴하고 그것을 전도시키는 언어 기법을 통해<br />
현실 개념과 정상성 속에 은폐되어 있는 왜곡된 현실의 모습을 폭로한다. 27) 이<br />
장에서는 우선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 의 흡혈귀주의의 이해를 위해 그 이전의<br />
두 작품에 나타나는 흡혈귀 모티브의 특징과 흡혈귀가 구현하는 타자적 특성을<br />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br />
24) Vgl. Hans Richard Brittnacher: a.a.O., 167f. 필자에 따르면 19세기 여성 흡혈귀 이야기들은<br />
주로 남성 작가에 의해 그리고 남성의 시각에서 씌어진 것들이다. 여기서는 주로 남성의<br />
성적 소망이 여성 흡혈귀에게 고통당하는 남성 희생자에게 투사되어, 여성 흡혈귀는 난폭<br />
한 팜므 파탈이나 불안한 유령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급기야 여성에 대한 세기말<br />
남성의 불안 혹은 피해의식은 마조히즘적 패배 및 굴종과 고통에서 성적 쾌락을 발견한다<br />
는 것이다.<br />
25) Oliver Claes: a.a.O., S. 25.<br />
26) Vgl. Clemens Ruthner: Untote Verzahnungen, S. 40.<br />
27) Vgl. Oliver Claes: a.a.O., S. 64f.
4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제목에서 이미 타자의 존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흡혈귀주의를 주제로 하는 초<br />
기 작품 낯선 자. 한 여름 밤의 안정을, 어느 공동묘지의 안정을 깨뜨리는 자<br />
(1969) 28)에서는 흡혈귀가 ‘이방의 침입자’로 등장한다. 이 이야기는 고전적인 흡<br />
혈귀 서사의 줄거리 구조를 따라가고 사건은 아주 상투적으로, 즉 어두운 밤이<br />
나 보름달이 뜬 공동묘지나 무덤과 같이 낭만적이면서도 전율을 일으키는 기이<br />
한 분위기 속에서 일어난다. 하지만 이러한 상투성은 곧 언어와 형식의 유희를<br />
통해 변형되고 해체된다. 여기서 흡혈귀 모티브는 기존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br />
기능을 하지 않고 외관상의 확고한 경계들을 의문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br />
우선 낯선 자로 등장하는 흡혈귀의 성적 정체성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호한 채<br />
로 남아 생물학적 성차에 입각한 뚜렷한 성적 경계를 허문다. 또한 낯선 자는<br />
“한 무리의 씻지 않은 더러운 토착민” 29)으로 묘사됨으로써, 낯선 자와 토착민의<br />
경계 역시 사라진다. 이처럼 흡혈귀 모티브는 낯선 것과 친밀한 것, 좋은 것과<br />
악한 것 등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를 흐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 한편 토착민들은<br />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낯선 자들을 외부인으로 규정하고 공동체에서 제외시<br />
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그래서 흡혈귀는 ‘낯선 자’, ‘타자’로 제외된다. 하지<br />
만 거꾸로 뒤집어 친밀하지 않은 것을 구현하는 흡혈귀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br />
토착민이 낯선 자이다. 이 공동체가 피상적으로 드러내는 활기가 없을 정도로<br />
지극히 안정된 정상적인 모습 뒤에는 내부와 외부로의 적대감이 도사리고 있다.<br />
따라서 이 공동체는 내부로는 억압을 통해 밖으로는 배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br />
과 질서를 확립하는 일종의 사회화 과정의 모델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스스<br />
로에게 만족하고 안주하는 토착민들은 낯선 것이 지니는 특유의 능력을 인식할<br />
수 없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한 여인이 흡혈귀의 무덤 위에 흰 장미를 갖다 놓<br />
는데, 이 익명의 손만이 그러한 능력의 간파를 암시한다. 낯선 자 에서 묘사되<br />
는 이방인으로서의 흡혈귀는 ‘진정한 남성의 손을 가진 자’로서, 무관심하게 텔<br />
레비전 앞에만 앉아 있는 남편보다 더 많은 것을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이<br />
28) Vgl. Elfriede Jelinek: Der fremde! störenfried der ruhe eines sommerabends der ruhe eines<br />
friedhofs, in: Der gewöhnliche Schrecken. Horrorgeschichten. Übersetzt v. Peter Handke,<br />
Salzburg 1969. S. 135-147.<br />
29) Ebd., S. 135.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43<br />
다. 하지만 이 낯선 자로 인해 여성이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깨닫고 스스로 그<br />
충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여성이 성적 해방을 이룰 수 있는지<br />
는 의문인데, 결국은 흡혈귀가 흡혈귀 사냥꾼인 치과의사에게 살해당함으로써<br />
남성 지배라는 기존의 조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br />
옐리넥이 흡혈귀 모티브를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은 내쫓긴<br />
자들 (1980) 30)이다. 여기서는 인간 사이의 권력관계를 특징짓기 위해, 즉 인간관<br />
계의 심리적, 성적 착취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흡혈귀 모티브가 사용된다. 특히<br />
흡혈귀 모티브는 길에서 남성을 성적으로 공격하고 한스와의 적극적인 성적 체<br />
험을 시도하는 안나와 연결되어 나타난다. 옐리넥은 이 소설에서 흡혈귀의 특징<br />
을 띤 행동방식들을 우월성과 동시에 허약성에 결부시킨다. 이 행동들은 폭력의<br />
상황을 전도하려는 시도, 즉 무기력한 자들이 권력을 제 것으로 전유하려는 시<br />
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하고 인물들은 허약한 최초의 상태에 여<br />
전히 매어 있다. 남성의 성적인 지배력에 내맡겨져 있다는 감정에서 유발된 안<br />
나의 흡혈귀와 같은 사랑의 공격은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도이다. 즉<br />
현실적인 권력이 없는 입장에서 흡혈귀 이미지를 통해 여성의 성적 우월성을 연<br />
출하면서 허구적인 권력을 전유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나<br />
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여성 흡혈귀의 이미지는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 의 흡혈<br />
귀적 특성을 어느 정도 선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Ⅳ.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 : 여성과 예술의 흡혈귀 되기<br />
옐리넥은 1987년에 발표한 희곡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 (이후 질병 으로<br />
약칭함)에서 전통적인 흡혈귀 모티브를 독특하게 가공, 변형함으로써 그 모티브<br />
의 창조적 가능성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이 희곡의 플롯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br />
아이를 낳는 기계로 취급되는 가정주부 카밀라는 여섯 번째 아이를 낳다 죽은<br />
뒤에 치과 및 산부인과 의사인 하이트클리프 31)의 약혼녀이자 간호사로 등장하<br />
30) Vgl. Elfriede Jelinek: Die Ausgesperrten, Reinbek bei Hamburg 1985.<br />
31) 이 이름은 영국 작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의 주인공 히스클리프를 연상시키며,
4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는 흡혈귀 에밀리에 의해 흡혈귀로 다시 태어난다. 두 여성은 레즈비언 흡혈귀<br />
가 되어 각자의 남편을 상대로 싸우고 자신의 처지와 여성으로서의 실존에 대해<br />
토로하며 아이들을 먹이로 연명하다가 결국은 흡혈귀 사냥꾼이 된 두 남편에 의<br />
해 사살되고 만다. 옐리넥은 바흐만에 관한 한 에세이에서 “여성은 타자이고 남<br />
성은 규범이다. 남성에게는 현재의 위치가 있고 그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면서<br />
기능을 한다. 여성에게는 장소가 없다.” 32)라고 피력하는데, 이것은 이 극의 전체<br />
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질병 에서는 이와 같이 남성사<br />
회의 가부장적인 지배 속에서 자기 고유의 삶을 거부당한 채 단순히 생물학적<br />
존재로서, 타자로서 간주되는 여성들 33)의 남성에 대한 반격을 보여준다. 여기서<br />
여성들은 남성의 지배적인 도덕과 질서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존재로서, 일반<br />
적으로 낯설고 두려운 국외자로 형상화되어 온 흡혈귀로 등장한다.<br />
옐리넥의 질병 에는 작품 시작에 앞서 ‘중국의 명장 화가가 자신의 그림 속<br />
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의 중국 그림에 관한 에바 마이어의 짧은 글<br />
이 인용되고 있다. 34) 여기서 여성은 완전성을 추구하는 남성과 달리 자신의 그<br />
림(이미지)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타남과 사라짐을 반복하<br />
질병 에서는 여성의 몸의 상부와 하부 - 이는 머리/사고와 하체/성을 의미함 - 를 점유, 통<br />
제하는 치과 및 산부인과 의사로 등장한다.<br />
32) “Die Frau ist das Andere, der Mann ist die Norm. É́r<br />
hat seinen Standort, und er<br />
funktioniert, Ideologien produzierend. Die Frau hat keinen Ort. Mit dem Blick des<br />
sprachlosen Ausländers, des Bewohners eines fremden Planeten, des Kindes, das noch nicht<br />
eingegliedert (>>ge-gliedert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45<br />
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도 그렇다고 완전<br />
히 그 안에 존재하지도 못하는 여성적 원칙’이 바로 질병 의 여성 (그리고) 흡<br />
혈귀를 통해 구현된다. 35) “우리는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 Wir sind<br />
und sind nicht!”, “우리는 죽음도 생명도 아니다 Wir sind nicht Tod, nicht<br />
Leben!”(K 230)라는 에밀리의 존재 규정에서 이중적이고 불완전하며 중간적인<br />
위치에 처한 흡혈귀적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질병 에서 묘사되는<br />
여성 흡혈귀는 흡혈귀의 핵심적 특징인 존재와 비존재 사이의 경계성, 살아있으<br />
나 생명이 없는 것, 즉 실존하는 부정성의 역설로 특징지어진다.<br />
옐리넥은 질병 에서 흡혈귀주의를 크게 두 가지 주제와 관련시키는데, 첫째<br />
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성과 실존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기능<br />
이다. 오로지 아이의 출산에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평범한 가<br />
정주부로서 결국 흡혈귀가 된 카밀라를 통해, 옐리넥은 남성 지배적 문화 속에<br />
서 여성이 인간이 되는 것을 방해받고 거부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br />
세무사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만 살다가 죽은 카밀라는 “나는 반쪽도<br />
아니고 전체도 아니다. 나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 Ich bin nichts Halbes und nichts<br />
Ganzes. Ich bin dazwischen”(K 201)라고 자신을 정의한다. 36) 카밀라의 ‘그 사이’<br />
의 실존은 흡혈귀의 특징인 중간적 상태를 가리키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현대 사<br />
회 속에서 여성이 처한 “장소부재성 Ortlosigkeit” 37)에 상응한다. 이는 앞서 바흐<br />
만 에세이에서 언급된 ‘타자로서 존재하는 여성’에게 ‘장소가 없다’는 것과 같은<br />
맥락이다. 다시 말해서 카밀라의 존재는 남성적 규범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사<br />
회에서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하고 남성의 타자로<br />
서 정의된 채 흡혈귀의 특성인 ‘그 사이’의 불완전한 실존을 강요당하는 여성의<br />
상황을 구현한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 의 흡혈귀주의는 역사와 현재 속에서 사<br />
회적,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여성 실존에 대한 메타포” 38)로 간주될 수 있다. 한<br />
35) Vgl. Elfriede Jelinek: “Die Lady ― Ein Vampir?”, S. 34.<br />
36) 더 나아가 카밀라는 자신의 존재를 ‘무’로 규정한다. “Ich bin eine Dilettantin des<br />
Existierens. (...) Ich bin restlos gar nichts.”(K 203)<br />
37) Anke Roeder: Ich will kein Theater. Ich will ein anderes Theater. Gespräch mit Elfriede<br />
Jelinek, in: Ders.: Autorinnen. Herausforderungen an das Theater, Frankfurt am Main 1989,<br />
S. 141-160, hier S. 143.
4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편 여기서는 ‘질병’만이 여성이 주체로 존재하고 여성적인 것과 건강에 대한 남<br />
성적 규정에 반항할 수 있는 여성의 마지막 가능성으로 남는다. 39) 그래서 카밀<br />
라는 질병을 자신의 실존과 여성적 정체성의 토대로 근거 짓는다. 40) 흔히 ‘질병’<br />
은 건강과 위생을 해치는 것으로서 특히 적대적인 흡혈귀 이미지와 연관하여 집<br />
단적인 감염이나 오염, 그로 인한 집단의 격리나 배제, 격퇴를 상기시킨다. 하지<br />
만 질병의 메타포는 역으로 ‘건강한 것의 테러에 대한 생산적인 거부’ 41)로서, 또<br />
한 시민사회의 아웃사이더인 예술가 및 예술의 위치 그리고 예술적 창조성과도<br />
연관된다. 특히 세속적 삶에 대한 포기와 환상의 공동 작용 속에서 창조적 실존<br />
을 만들어 내는 여성 작가의 상황이 질병과 예술적 창조성의 연관을 통해 표현<br />
되곤 한다. 42) 옐리넥은 ‘무 Nichts’를 벗어나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 병을 과장<br />
되게 가장하고 연출하는 카밀라를 통해 질병과 여성성을 밀접하게 관련짓는 문<br />
학 및 문화 담론 43)을 환기시킨다. 나아가 질병 의 여성 흡혈귀는 악하고 신성<br />
모독적인 만행이나 피, 더러움 등 이른바 남성적 질서체계를 파괴하는 무정부주<br />
의적인 원칙을 대변한다. 반면에 위생과 건강 담론은 규범적인 남성성과 연결된<br />
다. 질병 에서 두 남자들은 카밀라와 에밀리에게 위생을 요구하는 44) 동시에 건<br />
강한 육체, 환경보호, 사회위생의 이름으로 그녀들을 박멸하려고 시도한다. 또한<br />
남성들은 스스로를 자연애호가로 자처하는 반면, 예술과 인공성에 대한 에밀리<br />
38) Sigrid Berka: Ein Gespräch mit Elfriede Jelinek, in: Modern Austrian Literature, 26.<br />
2(1993), S. 127-155, hier S. 134.<br />
39) Vgl. Anke Roeder: Ich will kein Theater, S. 147.<br />
40) 카밀라는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패러디하며 질병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Ich bin krank,<br />
daher bin ich.” “Ich bin krank und daher berechtigt. Ohne Krankheit wäre ich nichts.”(K<br />
232) “Ich bin krank, und es geht mir gut.”(K 233)<br />
41) “als produktive Verweigerung gegenüber dem Terror des Gesunden”. Elfriede Jelinek: Ich<br />
will kein Theater, S. 147.<br />
42) 이것은 삶의 포기와 질병 속에서 오히려 생명력 있는 문학을 꽃피운 에밀리 브론테를 연상<br />
시키며, 허구적인 인물인 에밀리 역시 “나는 전염병 속에서 번성한다 Ich gedeihe inmitten<br />
von Seuchen.”(K 209)라고 말한다.<br />
43) 카밀라의 남편인 벤노는 이런 맥락에서 “Ihr seid eine einzige Geschichte der Krankheit(K<br />
242))라고 말하고 있다.<br />
44) 에밀리의 약혼자인 하이트클리프는 여자들에게 “Seid hygienisch!”(K 241)라고 외치며 청<br />
소를 종용한다. 여기서 위생은 ‘오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오물의 제거를 정당<br />
화한다.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47<br />
의 변호 45)는 여성과 여성의 성욕을 자연으로 간주하는 남성중심적이고 생물학<br />
주의적인 사유 46)를 전복시킨다. 여성을 자연과 동일시하는 남성중심의 사유는<br />
질병 의 대조적인 무대배경 ― 즉 한 쪽에는 정돈되지 않은 자연을 상징하는<br />
‘황야’와 그 옆의 문화와 자연 지배를 상징하는 ‘병원’ ― 에서도 시각적으로 드<br />
러날 뿐 아니라, 카밀라의 몸을 마치 물건 다루듯 하면서 객체화하는 두 남성의<br />
행동과 말 47)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된다. 그러나 자연으로서의 여성이란 남성의<br />
자연 지배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자연에 대한 동경과 환상이 도출해낸 허구일<br />
뿐이다. 즉 여성은 자연과 같이 남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할 영역도 아니고 또한<br />
파괴된 세계로부터의 피난처도 아니다. 48) 질병 에서 여성이 자연의 법칙을 위<br />
반하는 흡혈귀로 등장한다는 설정 자체가 ‘여성은 곧 자연’이라는 남성 담론의<br />
규정을 전도시킨다. 노골적으로 팔루스적 권력을 참칭하며 여성의 능동적인 욕<br />
망을 연출하는 에밀리의 인공 송곳니 49)와 아이들을 잡아먹는 카밀라의 식인주<br />
의 그리고 여성 동성애 등을 통해, 여성 흡혈귀들은 이른바 ‘자연스러운’ 여성의<br />
성과 출산 및 모성의 신화를 전도시킨다. 이로써 이데올로기로 굳어진 자연과<br />
인공성의 경계를 해체하고, 모든 것이 남성 지배 문화에 의해 생산되고 구축된<br />
담론임을 폭로한다.<br />
한편 질병 의 여성 흡혈귀의 존재는 상호텍스트성과 환유적 해석의 가능성<br />
속에서 매우 다양한 타자성의 의미들을 상기시킨다. 코기토와 자기에 대한 확<br />
45) 에밀리는 이렇게 말한다. “Natur bin ich, erinnere daher oft an Kunst.”(K 195). 이 말은 동<br />
시에 자연과 예술 및 인공성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br />
체시킨다.<br />
46) 이런 생각은 하이트클리프의 다음 말에서 노골적으로 표현된다. “Weil ich die Natur liebe,<br />
beschäftigt mich die Frau als solche.”(K 217)<br />
47) Vgl. K 215ff.<br />
48) 이는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보여주는 이율배반적인 자연관에 상응한다. 즉 자연은 그 미지<br />
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함으로써 통제와 지배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br />
자연의 아름다움과 힘이 미화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두 가지 경우 모두 자연<br />
을 타자로 배제하는 것이며, 이것은 자연과 동일시되는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br />
49) 에밀리는 약혼자이자 치과의사인 하이트클리프에게 탈부착이 가능한 - 즉 흡혈귀처럼 사<br />
라졌다 나타났다 할 수 있는 - 인공적인 (흡혈귀의) 치아 장치를 요구하는데, 이는 여성의<br />
‘보이지 않는’ 욕망을 남성의 페니스처럼 분명하게 ‘가시화’하고 주체적으로 드러내고자<br />
하는 의도를 표현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남성의 욕망을 단순히 기술적인 장치로 축소함으<br />
로써 남성의 페니스에 대한 우월감을 조롱한다.(Vgl. K 222)
4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신 50)을 가지고 파시즘적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 중심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제된<br />
타자’로서 여성의 흡혈귀적 실존은 파시즘적 권력에서 제외된 다른 타자들과 공<br />
동연합을 형성한다. 그것은 건강한 문화의 타자인 질병, 레즈비언이나 동성애와<br />
같은 이른바 ‘도착적’ 성관계, 반유대주의의 유대인상 51) 혹은 다른 계급이나 인<br />
종 등의 타자들로 확장된다. 또한 파시즘적 이데올로기를 통한 남성에 의한 여<br />
성의 식민화 프로그램은 인종적 식민화와 동일한 맥락에 놓이며, 마지막 장면에<br />
서 남성 파트너들이 여성 흡혈귀를 ‘외부의 적’으로 간주하여 살해하는 것은 나<br />
치의 유대인 학살과 공명한다. 그 외에도 동정녀 마리아의 모성상과 예수의 만<br />
찬을 조롱하고 패러디하면서 52) 서구의 기독교적 사유에 배치되는 신성모독적인<br />
행위를 표현하는 등, 질병 에서는 서구 역사에서 생산되어 온 타자들의 모습을<br />
흡혈귀 형상을 빌어 종교, 철학, 문화와 예술의 다양한 차원에서 전복적으로 들<br />
추어낸다. 53)<br />
질병 에서 흡혈귀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여성 예술가와 예술 자체의 미학적<br />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난다. 작가와 흡혈귀 사이의 유비적인 관련성에 관해서는<br />
문학사를 통해 익히 알려진 ‘기생하는 아웃사이더’로서의 작가의 위치와 ‘타자<br />
의식’을 언급할 수 있다. 54) 또한 작가들이 타인의 경험에 기생한다는 점에서도<br />
흡혈귀적 특징을 띤다. 이런 맥락에서 옐리넥은 피아노 치는 여자와 관련하여<br />
50) 에밀리의 약혼자로서 턱전문의 및 치과의사인 동시에 산부인과의사인 하이트클리프는 극<br />
의 첫 장면에서 자신에 관해 이렇게 정의한다. “Ich bin der, an dem ein anderer mißt.”(K<br />
193) “Ich bin ein Maß.”(K 194).<br />
51) 옐리넥은 질병 에서 괴벨스의 자서전 미하엘과 히틀러의 나의 투쟁에서 선전된독일<br />
적 사유 - 즉 순수한 피는 독일성과, 이 순수한 피를 더럽히는 병균과 같은 존재는 유대인<br />
과 연결하는 사유 - 를 여성과 관련시켜 패러디하고 왜곡한다. Vgl. Sigrid Berka: Das<br />
bissigste Stück der Saison. The Textual and Sexual Politics of Vampirism in E. Jelinek’s<br />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 in: German Quarterly 68(1995), S. 372-388, hier S. 381f.<br />
52) 에밀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가 만찬에서 한 말을 패러디한다. “Ich bin der Anfang und das<br />
Ende. Von dem ich esse, der wird ewig leben.”(K 210)<br />
53) Vgl. Sigrid Berka: a.a.O., S. 376.<br />
54) 이에 관련하여 18세기 이후 문학의 변화된 역할을 주요한 근거로 들 수 있다. 문학은 시민<br />
사회의 가치 영역의 분화에 따라 사적인 것을 공적으로 재현하는 매체가 되었고, 이른바<br />
인간 심연의 비합리적이고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에 따라 작가 역시 시민사회<br />
의 공적 질서를 비판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서 타자의식을 지니게 되었는데, 하지만 동<br />
시에 그는 사회에 기생하는 아웃사이더라는 점에서 흡혈귀적 특성을 띠게 된 것이다. Vgl.<br />
Silvia Volkmann: a.a.O., S. 163f.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49<br />
자신의 작가 활동을 흡혈귀적인 것으로 특징지으면서, “이 책에서 나는 나와 나<br />
의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었다. 작가들은 그야말로 흡혈귀들이다” 55)라고 고백하<br />
고 있다. 질병 에서도 옐리넥은 에밀리 브론테를 모델로 하는 간호사이자 작가<br />
인 에밀리를 통해 여성 예술가의 실존 내지 예술 자체가 흡혈귀적 특성을 지녔<br />
음을 드러낸다. 질병 에서 두 여성 흡혈귀는 남성 사회의 주변부에서 그림자처<br />
럼 살아가는 타자이자 아웃사이더인 동시에 인용과 문학적인 소도구들로 구성<br />
된 상호텍스트적인 흡혈귀의 삶을 근근이 이어나간다. 특히 에밀리는 ‘그 사이’<br />
의 흡혈귀적 실존을 내세우며 56) 인용을 통해 다른 텍스트의 피를 빨아먹고 그것<br />
을 덮치고 사멸시키는 시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시를 창조하는 대신 바꿔쓰기와<br />
다시쓰기를 통해 ‘엮어낼’ 따름이다. 57) 또한 예수의 인용에 기초한 성경구절 다<br />
시쓰기 58)는 의례화된 의미를 텍스트적인 의미로,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단순한<br />
통사적인 내용으로 변형시키면서 원본 텍스트에 치명적인 흡혈귀적인 흔적을<br />
남긴다. 여기서 ‘글쓰기’와 ‘인용하기’는 교환 가능한 것이 되며, 59) 이러한 인용<br />
을 통한 글쓰기 방식은 — 피의 순환체계와 마찬가지로 — 텍스트의 순환체계를<br />
놀라게 하고 교란시키는 흡혈귀적 특성을 띠게 된다. 60) 여성 흡혈귀의 삶을 여<br />
성의 예술창조와 예술관에 대한 메타포로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옐리넥의 예술<br />
이해와도 연관된다. 옐리넥은 천재성과 독창성을 내세우는 남성적 예술 개념을<br />
전도시키고, 예술 작품의 생명은 과거의 죽은 텍스트의 소화에 의존한다는 것을<br />
‘인용’과 ‘패러디’, ‘풍자’로 짜깁기된 그녀의 흡혈귀적 텍스트 실천을 통해 드러<br />
55) Elfriede Jelinek über den Roman “Die Klavierspielerin”, in: Sigrid Löffler: Der sensible<br />
Vampir, S. 35, zit. nach Oliver Claes: a.a.O., S. 65.<br />
56) “Ich bin der Anfang und das Ende. Dazwischen komme ich auch noch öfter vor.”(K 196)<br />
57) “Ich habe sie selbst gestrickt.”(K 234)<br />
58) 각주 52) 참조.<br />
59) 에밀리 자신이 ‘글쓰는 작가’이면서 동시에 (에밀리 브론테의) ‘인용’이기도 하다. 나아가<br />
에밀리는 글쓰기와 인용하기를 동일시하는 텍스트적 실천을 통해 이중적인 탈구성을 야기<br />
한다. 즉 그녀는 독창적인 의미를 창조하는 작가의 형상과 원본 텍스트의 구상을 파괴한<br />
다. Vgl. Birgit R. Erdle: Die Kunst ist ein schwarzes glitschiges Sekret. Zur feministischen<br />
Kunstkritik in neueren Text Elfriede Jelineks.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br />
Germanistik, in: Mona Knapp und Gerd Labroisse(Hg.): Frauen-Fragen in der deutsch-<br />
sprachigen Literatur seit 1945, Amsterdam-Atlanta GA 1989, S. 323-341, hier S. 337.<br />
60) Vgl. Sigrid Berka: Ein Gespräch mit Elfriede Jelinek, S. 134f.
5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낸다. 이런 맥락에서 질병 의 등장인물들이 쏟아내는 이야기들은 온통 문학 및<br />
철학 텍스트, 신문, 광고 슬로건이나 상용구 등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띤 인용들<br />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들은 그로테스크한 몽타주를 통해 상투적인 성 담론들<br />
을 해체시킨다. 나아가 옐리넥의 희곡에서는 대상 언어가 메타언어가 되고 또<br />
메타언어적 지평이 그대로 무대 위에 연출된다. 61) 이러한 애매한 언어유희의 수<br />
법은 남성의 흡혈귀 문학에 여전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숭고함을 전혀 발생시<br />
키지 않고 오히려 메타언어가 지닌 신성함을 모독하고 희화화하는 데 기여한다.<br />
옐리넥의 이러한 언어 테크닉과 낯설게 하기의 기법, 인용과 콜라주 그리고 동<br />
일시를 차단하기 위한 인위적인 인물 연출 62) 등은 이 희곡이 지닌 포스트모던<br />
적 63) 혹은 포스트드라마적 특징을 보여준다. 옐리넥은 에밀리를 통해 문학의 흡<br />
혈귀적 특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스스로도 다른 텍스트에서 빨아들인 이질적인<br />
언어 습득물을 가지고 여성과 흡혈귀와 예술의 이미지들을 냉소적으로 융합하<br />
여 질병 을 엮어낸다.<br />
한편 질병 의 후반(2막 6장)에서 레즈비언 흡혈귀인 에밀리와 카밀라는 샴쌍<br />
둥이처럼 서로 합체된 ‘이중형상 Doppelgeschöpf’으로 변한다. 여기서 옐리넥은<br />
고대의 기원 신화의 일부분을 전유하면서도 남성의 동성애적 사랑 대신에 여성<br />
61) 옐리넥은 롤랑 바르트가 일상의 신화에서 신화를 기호학적으로 개념 정의한 것을 자신<br />
의 문학적 언어수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녀는 억압당하는 자의 “대상언어”와 억압하는<br />
자의 신화적인 “메타언어”를 구별하면서 바르트 이론의 마르크시즘적 함의에 자신을 연결<br />
한다. 여기서 비판의 초점은 두 기호체계의 간섭 현상으로서, 의미로 충만한 대상언어적인<br />
기호가 의미와 역사가 증발되어 버리는 공허한 형식으로, 즉 신화적이고 메타언어적인 형<br />
식으로 변형되어 버린다는 점이다. Vgl. Marlies Janz: Elfriede Jelinek, Stuttgart 1995<br />
(Sammlung Metzler), S. 10ff.<br />
62) 옐리넥은 자신의 극에서 현실적인 삶의 관념으로 존재하는 통일적인 거짓된 삶의 모습을<br />
보여주는 것을 거부한다. 따라서 그녀는 심리적인 극을 반대하며, 그녀가 만들어내는 인물<br />
들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꼭두각시 내지 허깨비와 같은 모습을 보이며 오로지 ‘말’을 통해<br />
서만 존재하는 언어의 허울과 같은 존재들이다. Vgl. Elfriede Jelinek: Dieses vampirische<br />
Zwischenleben. Interview mit Dieter Bandhauer, in: Die Tageszeitung 9. Mai 1990; Anke<br />
Roeder: Ich will kein Theater, S. 143, 153.<br />
63) 옐리넥의 극이 전체성을 거부하고 주체의 통일성 개념에서 벗어나는 점이나 언어 수법에<br />
서는 포스트모던의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옐리넥 자신은 ‘모든<br />
것이 가능하다’는 포스트모던의 슬로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텍스트가 현실참여적<br />
이고 정치적인 진술에 매어 있다는 점에서 자신은 포스트모던 흐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br />
한다. Vgl. Anke Roeder: Ich will kein Theater, S. 154.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51<br />
의 동성애적 결합을 연출해낸다. 64) 다시 말해서 에밀리와 카밀라의 이중형상은<br />
고대의 남성 동성애를 패러디하면서 전복시키는 레즈비언의 형태로 묘사되며,<br />
이로써 남성 중심적인 성욕과 생식의 통일적 관념도 파괴된다. 65) 이런 레즈비언<br />
적 결합은 한편으론 여성 흡혈귀가 구현하는 타자성의 유토피아적 지향성을 제<br />
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66)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레즈비언적 결합마저도 이성<br />
애의 “둘이 하나가 된다는 사랑 신화의 패러디” 67)로 볼 수 있는 까닭은 두 여성<br />
의 관계에서도 이성애적 관계처럼 위계에 따른 역할분배가 반복되어 나타나기<br />
때문이다. 특히 2막의 반쪽 무대 배경은 에밀리와 카밀라가 함께 사는 50년대<br />
스타일의 침실로 꾸며져 “가족”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두 여성이<br />
보여주는 일상적인 부부관계의 모습은 이들이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 이데올<br />
로기’에 매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68) 이런 맥락에서 베르카 또한 에밀리와 카밀<br />
라의 레즈비언적 사랑 자체를 유토피아적으로 읽어내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br />
그녀에 따르면, 질병 의 마지막에 연출되는 욕망의 주체가 되려는 여성의 시도<br />
를 상징하는 이 이중형상의 파괴는 옐리넥이 당대의 이데올로기적인 페미니즘<br />
을 비판하고 오히려 해체주의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69)<br />
64) 이 이중형상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플라톤의 향연에 나오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남녀 탄<br />
생 신화에 대한 패러디로 보는 관점이다. 이 신화에서는 본래 세 가지 성, 즉 남성, 여성,<br />
양성으로 이루어졌던 구모양의 인간이 후에 서로 분리되어 남과 여로 갈라졌고, 이로 인해<br />
서로에 대한 다양한 성적 욕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신화의 재생산에 대한 표<br />
상에서는 남성이 생산의 주체가 되고 여성은 남성성이 결여된 질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br />
리스토파네스에 따르면 남성의 동성애적 사랑이 사랑의 최고 완성된 형태라는 것이다.<br />
Vgl. Oliver Claes: a.a.O., S. 110ff.<br />
65) Ebd.<br />
66) Vgl. Corinna Caduff: a.a.O., S. 118f. 포스트구조주의의 페미니즘 담론(대표적으로 이리가<br />
라이, 크리스테바, 식수스)과 옐리넥의 질병 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비교하여 읽는 카더프<br />
는, 질병 의 여성성 구상이 프랑스 페미니즘 담론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br />
그 담론에서 여성 주체 해방의 유토피아적 잠재성을 읽어낸다. 또한 카더프는 질병 의 이<br />
중형상의 레즈비언적 결합이 이러한 유토피아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극<br />
마지막에 이 이중형상이 파괴됨으로써 프랑스 페미니즘이 보여주는 ‘해방의 유토피아적<br />
성격’을 옐리넥이 결국은 부인한다고 보았다.<br />
67) Birgit R. Erdle: a.a.O., S. 334.<br />
68) 여기서 카밀라는 여전히 기존의 모성 신화의 여성상을 보여준다.<br />
69) 베르카는 옐리넥의 여성성 구상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여성성 구상이 밀접한 연관 속에있다<br />
고 본다. 그녀는 카더프와 달리 70년대 프랑스 페미니즘의 유토피아적 경향성을 원칙적으<br />
로 부인하며, 따라서 이 이중형상은 여성의 주체성을 강하게 요청했던 당대의 이데올로기
5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요컨대 그녀에 따르면 여성 흡혈귀를 통해 표현되는 여성성은 “재현할 수 없는<br />
차이에 대한 역설적 알레고리 the paradoxical allegory of a non-representable<br />
difference” 70)이다. 이것은 바로 간호사이자 흡혈귀인 에밀리와 어머니이자 흡혈<br />
귀인 카밀라에게서 대립과 차이의 모순적 결합이 나타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의<br />
모순을 통해 여성성에 대한 투사 이미지와 그것의 전복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에<br />
서 기인한다. 71) 이러한 ‘탈중심화된 여성성’은 거울상과 같은 재현이나 이항대<br />
립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흡혈귀적 존재로서, 72) 상징계의 경계 너머에 독자적<br />
인 타자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73) 즉 여성은 ‘그 사이’의 흡혈귀적 실존 속에서<br />
남성적인 로고스중심주의와 자아 중심적 시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남성적인<br />
고정화를 부정하는 이질적인 ‘타자’가 된다. 74) 한편 극의 마지막에 레즈비언적<br />
사랑을 보여주었던 여성 흡혈귀들과 달리 흡혈귀 사냥꾼인 남성들은 오히려 폭<br />
적 패미니즘을 대변한다고 해석한다. Vgl. Sigrid Berka: Das bissigste Stück der Saison, S.<br />
379f.<br />
70) Ebd.. S. 380. 이런 맥락에서 질병 의 여성성은 기호계와 상징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과<br />
정 중의 주체’(크리스테바)로서, ‘상징계 이외의 어딘가’(루스 이리가레이)에 잉여로서 존<br />
재하면서 동일성의 계기를 지운다는 것이다.<br />
71) Vgl. Maja S. Pflüger: Vom Dialog zur Dialogizität. Die Theaterästhetik von Elfriede Jelinek,<br />
Tübingen u. Basel 1996, S. 64ff. 필자는 여성 흡혈귀 안에 결합된 이러한 차이들의 총합을<br />
통해 여성 인물의 정체성은 모호해지고 흡혈귀적인 애매성 속에서 담론의 경계를 가로지<br />
른다고 해석한다. 이는 특히 이미지의 과장과 전복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연출을 통해 가능<br />
해진다.<br />
72) Vgl., ebd., S. 379f. “In einem Spiegel sehe ich gar nichts”(K 227)에서 명시되듯이 질병<br />
의 여성 흡혈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이미지를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흡혈귀에게는<br />
거울이미지(재현상)가 없다.<br />
73) Vgl. Sigrid Weigel: ‘Das Weibliche als Metapher des Metonymischen’. Kritische Überlegungen<br />
zur Konstitution des Weiblichen als Verfahren oder Schreibweise, in: Inge Stephan und<br />
Carl Pietzcker(Hg.): Frauensprache―Frauenliteratur? Für und wider einer Psychoanalyse<br />
literarischer Werke, Tübingen 1986(Akten des V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br />
Bd. 6.), S. 108-118. 바이겔 역시 이리가라이를 따라 여성이 ’상징계 내부와 동시에 외부<br />
어딘가‘에 ’이중적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미지나 가장이나 메타포로 고착화될 수<br />
없는 ’실재하는 여성 die reale Frau‘을 변호한다. 이에 대해 루스 이리가라이(이은민 옮김):<br />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특히 98쪽(“그녀들은 또한 다른 곳에 있다”) 이하 참<br />
조.<br />
74) 여성의 타자성에 대한 요청은 “Ich bin das andere, das es aber auch noch gibt”(K 196) 그<br />
리고 “Ich möchte so gern einmal in einem Spiegel durch mich hindurch auf etwas anderes<br />
sehen.”(K 221)이라는 에밀리의 말에서 드러난다.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53<br />
력과 광기에 사로잡히고 잔인한 괴물로 변화된다. 그리고 여성들을 제거하려고<br />
마음먹으면서 그들의 언어는 점점 더 타락하는데, 통사구조가 파괴되고 개 짖는<br />
소리를 내는 등 의미는 와해된다. 질병 의 남성들은 오로지 자아의 틀에 갇혀<br />
자기 자신만을 재생산하고 복제할 뿐 75) 타자와 관계 맺지 않으며 타자를 배제,<br />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기형화되는 모습을 노출한다.<br />
Ⅴ. 옐리넥의 타자성 형상화에 대한 실천철학적 성찰<br />
옐리넥은 흡혈귀 모티브의 역사에서 핵심적 부분을 이루었던 의미들과 서사<br />
구조를 질병 에서도 유사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전통적인 흡혈귀서사와 달리<br />
옐리넥은 흡혈귀 모티브를 가차 없는 ‘자기성찰’에 기반 하여 다루고 있다. 여기<br />
서 흡혈귀주의는 남성과 여성간의 동일성과 타자성에 관한 담론으로 추상화될<br />
뿐 아니라 이질성을 띤 예술 및 문화 현상에 대한 은유로도 읽힌다.<br />
한편 옐리넥의 흡혈귀 극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여성의 타자적 실존이 처한<br />
딜레마이다. 질병 에서 여성은 다른 타자들과 공명하면서 스스로의 실존을 흡<br />
혈귀적인 비-실존으로 규정한다. 이것은 한편으론 남성 세계와 대립되는 사회의<br />
주변에서 병들어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오<br />
로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정의를 토대로 하여, 남성의 전도된 형태로서 ‘부<br />
정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남성의 투사에 의해 왜곡<br />
된 거울에 비친 왜곡된 여성 이미지이다. 76)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는 흡혈<br />
귀로 형상화되는 여성 혹은 타자는 실제로는 인류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남성의<br />
억압된 욕망과 두려움이 투사된, 남성 중심의 주체성과 로고스중심주의의 담론<br />
전략이 만들어낸 ‘여성 혹은 타자라는 구성물’로 드러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br />
로 흡혈귀적인 삶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로지르고 남성적 주체성과 동일성의<br />
75) 하이트클리프는 이렇게 주장한다. “Ich bin ich.” “Ich bin ich selbst.”(K 197, 213, 255)<br />
76) 얀츠는 이러한 왜곡 이미지의 중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드라마에서 분명하게<br />
드러난 언어뿐 아니라 그것의 저변에 깔린 텍스트 역시 어떤 올바른 것을 진술하지 않는<br />
다. 이미 거짓된 거울의 거짓된 거울로서, 이 드라마의 언어는 여성성과 여성에 대한 남성<br />
의 투사의 테두리 안에 머문다.” Marlies Janz: Elfriede Jelinek, S. 91.
54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틀을 깨며 고정되지 않고 재현되지 않는 ‘그 사이’ 혹은 상징계를 넘어 선 ‘다른<br />
곳’에 나머지로 존재하는 삶을 상기시킨다. 그렇다면 다음의 몇 가지 의문이 제<br />
기될 수 있다. 타자성을 구현하는 여성 흡혈귀는 남성에 의해 투사된 적대적인<br />
타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부유하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비유하는 형상<br />
인가? 만약 그런 경우라면 흡혈귀 형상은 남성의 타자로서의 이미지와 여성의<br />
동일시의 형상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를 그 자체로 구현하고 있는 ‘자기반어적<br />
인 모델’인가? 남성의 투사에 의해 왜곡된 이미지에 대한 순응과 부인의 과정<br />
속에서 자기 고유의 장소와 정체성을 상실한 여성은 ‘결핍’이라는 남성의 투사<br />
이미지를 거부하는 동시에 동일성 사유에 기초한 주체성도 거부해야 하는 딜레<br />
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결국 여성은 언표할 수 없고 재현될 수 없는 영원히<br />
이질적인 타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그렇다면 옐리넥이 질병 에서 형상화하<br />
고 있는 타자성은 현실적 차원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br />
이제 옐리넥이 흡혈귀 서사를 통해 제기한 타자성 문제를 최근의 실천철학적<br />
인 타자성 담론과 연관지어 성찰함으로써 질병 에서 형상화된 타자성이 현실<br />
적, 실천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지점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현재 논의되는 타자<br />
성 담론은 크게 세 갈래의 방향을 보여준다. 레비나스와 데리다는 ‘절대적인 타<br />
자’를 상정하고 이방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를 주장한다. 77) 그러나 절대적으<br />
로 타자를 환대한다는 것은 윤리적 판별의 모든 기준을 보류함을 의미한다. 이<br />
러한 해체주의적인 비-판단주의는 결정불가능성의 논리를 가지고 타자에 대한<br />
관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반면에, 정의와 불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게 한다<br />
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여기서 타자는 환원할 수 없는 이질성으로서 초월적 혹<br />
은 외재적으로 파악된다. 78) 한편 프로이트에게 있어 타자는 유령이 되어 되돌아<br />
온 우리 자신의 낯설어진 자아로서, 내면에 억압되었던 무의식적 두려움의 투사<br />
이다. 79) 이러한 프로이트의 발견은 인간이 지닌 낯선 것(타자)에 대한 깊은 무의<br />
77) 엠마누엘 레비나스(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 자크 데리다(남수인 옮<br />
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참조.<br />
78) 레비나스에게 타자는 지배할 수도 없고 결코 나로 환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외재성으로 묘<br />
사되며, 주체는 이기심을 버리고 타자를 영접하고 환대함으로써 윤리적인 주체로 설 수 있<br />
다는 것이다. 엠마누엘 레비나스(강영안 옮김): 앞의 책, 85쪽 이하 참조. 또한 이 책에 실<br />
린 강영안의 해설( 레비나스의 철학 ) 참조.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55<br />
식적 불안감의 보편적 경험을 표현한다.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독해가 지닌 정치<br />
적 함의들을 정교화하려는 크리스테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타자를<br />
진정 포용하는 것은 자아의 탈중심화 80)를 수용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가 ‘이<br />
방인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 이방인은 없<br />
으며 오직 우리와 비슷한 타자들이 있을 뿐이다. 81) 하지만 타자에 대한 이러한<br />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이질성을 무의식적 정신의 변증법으로 환원하려고 하는<br />
경향을 드러낸다. 한편 리쾨르의 비판적 자기 해석학은 타자에 대한 비판적인<br />
판단 ― 즉 적대적인 이방인인지 아니면 환대해야 마땅한 타자인지 ― 의 필요<br />
성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타자가 절대적으로 초월적이지도 또 절대적으로 내재<br />
적이지도 않으며, 그 양자 가운데 어디 즈음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또 다른<br />
자아와 소통하는 자아’와 함께 ‘관계적인 타자’를 상정하고, 타자성에 대한 해석<br />
학적 다원주의와 ‘이질성의 다의성’을 내세운다. 82) 비판적 자기 해석학은 타자<br />
가 동일성 안으로 매몰되거나(정신분석학의 경우) 접근 불가능한 타자성으로 내<br />
쫓기지(해체주의의 경우) 않도록 ‘타자와의 접촉’을 유지한다. 이러한 윤리적 접<br />
근은 타자를 적대적인 이방인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이 노력이 다양<br />
한 타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제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br />
다. 83)<br />
79) Vgl. Sigmund Freud: Das Unheimliche. Gesammelte Werke Bd. 12. Hg. v. Anna Freud,<br />
Frankfurt a. M. 1978. S. 229-268. 번역본으로는, 지그문트 프로이트(정장진 옮김): 두려운<br />
낯설음(프로이트 전집 18: 창조적인 작가과 몽상), 열린책들 1998, 97-150쪽 참조.<br />
80) 크리스테바는 이를 ‘depersonalization’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destructuration of the<br />
self’라고 명명한다. Vgl. Julia Kristeva: Strangers to ourselves, translated by Leon S.<br />
Roudiez,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 S. 169-192, hier S. 188.<br />
81) Vgl., ebd., S. 192.<br />
82) 리쾨르의 자기에 대한 해석학은 코기토의 옹호와 자격박탈에 대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br />
면서, 동일성을 자체동일성과 자기동일성의 변증법으로 파악함으로써 동일성 자체의 애매<br />
성과 다의성을 강조한다. 또한 자기성과 타자성도 변증법적 관계를 지님으로써, 타자성이<br />
자기성 자체를 구성하는 또 다른 다의성임을 강조한다. 나아가 리쾨르는 동일자와 타자의<br />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수용, 판별, 인정의 능력이 전제된다고 본다. 폴 리쾨르(김웅권 옮<br />
김):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특히 13-45, 419-467쪽 참조.<br />
83) 그래서 리처드 커니에 따르면 타자의 윤리학은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회색의 문제이며,<br />
‘둘 중 하나/또는’이 아니라, ‘양자 모두/그리고’를 택하는 것이다. 리처드 커니(이지영 옮<br />
김): 앞의 책, 116-148쪽(‘에어리언과 타자’), 451쪽(제3장의 미주 40) 참조.
56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옐리넥의 초기 작품인 낯선 자 에서는 내부 사회의 억압을 투사라는 심리적<br />
방어기제에 의해 타자에게 전가하는 타자의 배제 및 생산 전략이 묘사되며, 동<br />
시에 낯선 것과 친밀한 것의 경계가 의문시된다. 결국 이방인과 토착민은 서로<br />
에게 똑같이 낯선 타자이다. ‘여기서 과연 누가 이방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br />
수 있다. 데리다는 환대에 대하여에서 주인과 손님, 시민과 이방인, 자아와 타<br />
자의 전도가능성을 지적하는데, 이 전도가능성은 존재론적 실체의 고정된 이항<br />
대립주의에 도전하는 것이다. 한편 낯선 자 에서 에고에 사로잡힌 토착민은 자<br />
기 밖의 타자가 지닌 고유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없다. 여기서 옐리넥이 배제 메<br />
커니즘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방식은 해체주의적 타자 개념과 정신분석적 타자<br />
개념을 기초로 할 때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인의 무덤에<br />
꽃을 가져다 놓는 ‘익명의 손’을 통해 자기의 해석학에서 제시하는 ‘타자와 소통<br />
하는 자아의 모습’을 지향점으로 가리키고 타자에 대한 태도의 유연성과 해석의<br />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 같다. 반면에 질병 에서 옐리넥은 여성을 남성 중심의<br />
파시즘적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 타자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흡혈귀가<br />
남성에 의해 투사된 질병 내지 적의 이미지로서만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br />
식을 지닌 여성의 동일시의 형상으로도 제시된다. 여기서는 낯선 자 와 마찬가<br />
지로 정신분석학적 투사 메커니즘에 의한 타자화의 작용이 폭로되며, 동일성에<br />
기초한 타자의 억압 및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더구<br />
나 이 희곡의 마지막에 여성 흡혈귀가 흡혈귀 사냥꾼인 남성에 의해 무참히 살<br />
해되는 것에서는 현실적으로 서로에게 소통이 불가능한 적대적인 타자만이 남<br />
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필시 남성이 여전히 에고-코기토의 닫힌 순환에서 전<br />
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과, 그러는 한 여성 역시 소통하고 관계하는 자<br />
아가 아니라 그저 이질적이고 악한 타자로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에서<br />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낯선 자 와 달리 타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br />
가능성에 대한 요청도, 타자에게로 향하는 익명의 손도 없다. 남성 이데올로기<br />
의 이원론적인 배제와 경계 긋기의 담론에서 빠져 나가려고 유령의 모습을 연출<br />
하지만 그것마저도 절멸시키는 남성-타자를 통해 동일성의 틀을 벗어나려는 여<br />
성의 어떤 시도도 현재의 남성 지배적 현실 속에서 실현 불가능하다는 깨달음을<br />
일깨우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성 흡혈귀가 연출하는 경계를 가로지르고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57<br />
동일성을 지우며 재현이 불가능한 ‘그 사이’의 실존이 남성적 주체성과 로고스중<br />
심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는 내쫓긴 자들의<br />
안나에게서 보여지듯이 여성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br />
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 의 마지막에 여성<br />
흡혈귀가 죽는 것은 또한 여성과 같이 흡혈귀가 되는 남성의 죽음을 예고하는<br />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분법에 근거한 남성의 주체성과 동일성이란 투사적인<br />
(혹은 대립적으로 보충하는) 타자를 상정하지 않고서는 정립될 수 없으며, 타자<br />
가 제외된 동일성이란 스스로가 자폐적이 된 채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br />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남성의 실존의 토대인 여성의 제외는 남성 자<br />
신의 파괴로 귀결되고 만다는 것이다.<br />
옐리넥은 질병 에서 전통적인 흡혈귀 모티브를 전복적으로 가공하여 여성-<br />
타자에 대한 투사 이미지의 괴물적 특성을 가시화함으로써 투사이미지를 전유<br />
하는 동시에 대립과 차이들의 애매한 결합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비워내고 해<br />
체시킨다. 옐리넥은 여성 흡혈귀의 불안정하고 역설적인 형상을 통해 남성의<br />
‘투사이미지로서의 여성상’과 고유한 타자로서 ‘실재하는 여성 die reale Frau’ 사<br />
이에 존재하는 간극과 ‘차이의 틈’을 들추어내고자 한다. 84) 그리고 이것은 거리<br />
를 둔 제 삼자로서 작가가 지닌 ‘오만한 시선’ 85)으로부터, 나아가 ‘그 사이’라는<br />
‘흡혈귀적인 장소’로부터 이루어지는 흡혈귀적인 글쓰기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br />
진다.<br />
84) 이리가라이는 담화를 통한 여성 착취의 장소를 재발견하기 위해 ‘담화를 가로지르기<br />
Durchquerung’를 요구한다. 이는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여성성, 즉 남성이 여성에게 투사<br />
한 역할, 이미지, 가치의 가장무도회 속에 은폐된 것을 폭로하고 여성의 육체와 쾌락에 대<br />
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녀는 로고스중심적 철학 담론의 무의식을 분석하고 해석하<br />
여 여성이 언어/담론과 무의식에 대해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들춰냄으로써 실제 여성이 담화<br />
의 질서를 벗어나 상징계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곳’에도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주고자 한<br />
다. 또한 이러한 여성은 남성의 언어를 모방, 재생하면서 이들의 언어를 희화화하고 왜곡<br />
한다. 이리가라이의 이러한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 질병 의 문학적 수법과 닮아 있다.(이<br />
리가라이: 앞의 책, 98쪽 이하 참조) 얀츠 또한 “이미지와 여성의 실재와의 차이는 현대의<br />
가부장적인 투사 안으로 여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Vgl.<br />
Marlies Janz: a.a.O., S. 87)<br />
85) Vgl. Elfriede Jelinek: Dieses vampirische Zwischenleben. 그리고 각주 32) 참조.
58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Ⅵ. 나가며<br />
문학은 늘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고 경계를 가로지르며 동일자와 타자의 사<br />
이 공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과 연관들을 탐색하고 형상화해왔다. 그로써<br />
심미적 감수성을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타자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 능력을 배<br />
양해왔다. 문학과 예술이 애써 표현하듯이 인간의 정체성은 이미 그 안에 타자<br />
성을 포괄하는 것이거나 타자와의 만남에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우<br />
리의 정체성이란 필시 흡혈귀와 같이 불안정하고 환영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br />
런 연유로 타자와 소통하고 타자성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자아 역시 인정될 수<br />
있을 것이다.<br />
옐리넥은 질병 혹은 현대 여성들 에서 타자성을 구현하는 흡혈귀 모티브를<br />
통해 자아와 타자, 동일성과 타자성에 관한 남성 중심의 폐쇄적이고 이분법적인<br />
경계를 교란시키고 코기토의 닫힌 체계를 깨뜨리는 현실의 틈새와 균열을 들춰<br />
내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녀는 여성과 타자를 생산해내는 남성 중심의 담론을<br />
전도, 해체시키는 언어 및 서술기법을 통해 기존의 파시즘적이고 가부장적인 이<br />
데올로기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그 의미를 박탈한다. 동시에 옐리넥은 매우 극명<br />
하게 대립되는 남성상과 여성상, 남성과 여성의 서로 판이하게 다른 자아 이미<br />
지와 타자 이미지를 과장되게 연출, 수행하는 극적 과정을 통해 남성 지배 사회<br />
에서의 여성의 ‘장소 부재’와 정체성 상실에 대한 현실적이고 가차 없는 분석을<br />
제시한다. 옐리넥의 외관상 ‘과격하고 잔혹하며 그로테스크한’ 흡혈귀 연극은<br />
나와 너의 확고한 구분의 신화를 탈신화화하며 나와 타자의 교환가능성, 다양한<br />
이질성들에 대한 긍정을 일깨우고 비판적이고 윤리적인 방향의 타자의식을 환<br />
기시킨다.<br />
참고문헌<br />
1차 문헌<br />
Jelinek, Elfriede: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 in: Ders.: Theaterstücke, Reinbek bei
Hamburg 1992, S. 191-265.<br />
Jelinek, Elfriede: Die Ausgesperrten, Reinbek bei Hamburg 1985.<br />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59<br />
Jelinek, Elfriede: Der fremde! störenfried der ruhe eines sommerabends der ruhe eines<br />
friedhofs, in: Der gewöhnliche Schrecken. Horrorgeschichten. Übersetzt v. Peter<br />
Handke, Salzburg 1969, S. 146-160.<br />
Jelinek, Elfriede: “Dieses vampirische Zwischenleben.” Interview mit Dieter Bandhauer,<br />
in: Die Tageszeitung 9. Mai 1990.<br />
Jelinek, Elfriede: “Die Lady ― Ein Vampir?” With Roland Gross, in: Theater heute 27.<br />
4(1987), S. 34f.<br />
Roeder, Anke: Ich will kein Theater. Ich will ein anderes Theater. Gespräch mit Elfriede<br />
2차 문헌<br />
Jelinek, in: Ders.: Autorinnen. Herausforderungen an das Theater, Frankfurt a.<br />
M. 1989, S. 141-160.(= Elfriede Jelinek: Ich will kein Theater ― Ich will ein<br />
anderes Theater. With Anke Roeder, in: Theater Heute 8 (1989), S. 30-31.)<br />
레이몬드 맥널리/라두 플로레스쿠(하연희 옮김): 드라큘라. 그의 이야기, 루비박스 2002.<br />
리처드 커니(이지영 옮김):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개마고<br />
원 2004.<br />
루스 이리가라이(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br />
엠마누엘 레비나스(강영안 옮김):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2001.<br />
이선영: 경계 위의 존재 - 괴물의 미학, 실린 곳: 미술세계 통권 181호(1999. 12월)<br />
자크 데리다(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br />
지그문트 프로이트(정장진 옮김): 두려운 낯설음(프로이트 전집 18: 창조적인 작가과 몽<br />
상), 열린책들 1996, 97-150쪽.<br />
클로드 르쿠퇴(이선형 옮김): 뱀파이어의 역사, 푸른미디어 2002.<br />
폴 리쾨르(김웅권 옮김): 타자로서 자기자신, 동문선 2006 참조.<br />
Berka, Sigrid: Das bissigste Stück der Saison. The Textual and Sexual Politics of Vampirism<br />
in E. Jelinek’s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 in: German Quarterly 68<br />
(1995), S. 372-388.<br />
Bertschik, Julia/Tuczay, Christa A.: Poetische Wiedergänger. Einleitung, in: Dies.(Hg.):<br />
Poetische Wiedergänger. Deutschsprachige Vampirismus-Diskurse vom Mittelalter<br />
bis zur Gegenwart, Tübingen 2005, S. 7-10.<br />
Brittmacher, Hans Richard: Phantasmen der Niederlage. Über weibliche Vampire und<br />
ihre männlichen Opfer um 1900, in: Bertschik, Julia/Tuczay, Christa A.(Hg.):
60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Poetische Wiedergänger. Deutschsprachige Vampirismus-Diskurse vom Mittelalter<br />
bis zur Gegenwart, Tübingen 2005, S. 163-183.<br />
Caduff, Corinna: Ich gedeihe inmitten von Seuchen. Elfriede Jelinek-Theatertexte, Bern<br />
u.a. 1991.<br />
Claes, Oliver: Fremde. Vampire. Sexualität, Tod und Kunst bei Elfriede Jelinek und<br />
Adolf Muschg, Bielefeld 1994.<br />
Erdle, Birgit R.: Die Kunst ist ein schwarzes glitschiges Sekret. Zur feministischen<br />
Kunstkritik in neueren Text Elfriede Jelineks. Amsterdamer Beiträge zur Neueren<br />
Germanistik, in: Knapp, Mona/ Labroisse, Gerd(Hg.): Frauen-Fragen in der deutsch-<br />
sprachigen Literatur seit 1945, Amsterdam-Atlanta GA 1989, S. 323-341.<br />
Freud, Sigmund: Das Unheimliche. Gesammelte Werke Bd. 12. Hg. v. Anna Freud,<br />
Frankfurt a. M. 1978, S. 229-268.<br />
Freud, Sigmund: Totem und Tabu. Gesammelte Werke Bd. 9. Hg. v. Anna Freud u. a.,<br />
Frankfurt a. M. 1978.<br />
Gürtler, Christa(Hg.).: Gegen den schönen Schein. Texte zu Elfriede Jelinek, Frankfurt a.<br />
M. 1990.<br />
Janz, Marlies: Elfriede Jelinek, Stuttgart 1995.<br />
Kristeva, Julia: Strangers to ourselves, translated by Leon S. Roudiez, New York:<br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1.<br />
Pütz, Susanne: Vampire und ihre Opfer. Der Blutsauger als literarische Figur, Bielefeld<br />
1992.<br />
Rickels, Laurence: Warum Vampirismus? Die Darstellung oder Bestattung des Anderen<br />
vom Phantasma bis zum Film, in: Theorie der Alterität. München 1991. S.<br />
158-166.(Akten des VIII. Internationalen Germanisten-Kongresses Tokyo 1990.<br />
11. Bd.2).<br />
Ruthner, Clemens: Dämon des Geschlechts. Prolegomena zu Vampirismus und Gender<br />
in der neueren deutschsprachigen Literatur, in: Christine, Ivanovic' /Lehmann,<br />
Jürgen/May, Markus(Hg.): Phantastik - Kult oder Kultur? Aspekte eines<br />
Phänomens in Kunst, Literatur und Film, Stuttgart 2003, S. 215-238.<br />
Ruthner, Clemens: Untote Verzahnungen. Prolegomena zu einer Literaturgeschichte des<br />
Vampirismus, in: Bertschik, Julia/Tuczay, Christa A.(Hg.): Poetische Wieder-<br />
gänger. Deutschsprachige Vampirismus-Diskurse vom Mittelalter bis zur Gegenwart,<br />
Tübingen 2005, S. 11-41.<br />
Volkmann, Silvia: ‘Gierig saugt sie seines Mundes Flammen’. Anmerkungen zum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61<br />
Funktionswandel des weiblichen Vampirs in der Literatur des 19. Jahrhunderts,<br />
in: Berger, Renate/Stephan, Inge(Hg.): Weiblichkeit und Tod in der Literatur,<br />
Köln u. Wien 1987, S. 155-176.<br />
Weigel, Sigrid: ‘Das Weibliche als Metapher des Metonymischen'. Kritische Überlegungen<br />
zur Konstitution des Weiblichen als Verfahren oder Schreibweise, in: Stephan,<br />
Inge/Pietzcker, Carl(Hg.): Frauensprache--Frauenliteratur? Für und wider einer<br />
Psychoanalyse literarischer Werke, Tübingen 1986, S. 108-118.
62 뷔히너와 현대문학 33<br />
Zusammenfassung<br />
Vampirismus als Verkörperung des Anderen<br />
- In Bezug auf Elfriede Jelineks Theaterstück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 -<br />
Park, Eun-Joo (Yonsei Uni)<br />
Der aufklärerische moderne Diskurs, der die Ratio und die Identität des Subjekts<br />
behauptet hat, produzierte die Anderen durch den Ausgrenzungsmechanismus. Aber<br />
die Postmoderne wurde auf das Problem des Anderen und der Alterität noch stärker<br />
aufmerksam, weil Vorurteile und Hass gegen die Anderen immer noch ernste<br />
Probleme hervorrufen. Die Aufgabe dieses Aufsatzes ist zu untersuchen, wie das<br />
Andere in der Literatur gestaltet wird, besonders in Bezug auf das Vampir-Motiv in<br />
Elfriede Jelineks Krankheit oder Moderne Frauen. Seit dem 19. Jahrhundert wurde<br />
der Vampir als die Figur des Anderen, die Risse und Chaos herbeiführt, literarisch<br />
dargestellt. In der kulturellen Geschichte haben sich die Bedeutung und die Funktion<br />
des Vampir-Motivs verändert, dabei erscheinen die Themen, z.B. Krankheit und Tod,<br />
ewiges Leben, Liebe und Sexualität, Macht und Feindschaft sehr häufig. Im<br />
Besonderen wurden das Geschlechtsverhältnis und sexuelles Verlangen als Hauptthema<br />
behandelt. In Jelineks Krankheit wird der Vampirismus als das 'Dazwischen' zwischen<br />
Sein und Nicht-Sein, Tod und Nicht-Tod paradox charakterisiert. Der Vampirismus in<br />
Krankheit ist die Metapher für die Ortslosigkeit der Frauen, die in der männlichen<br />
Gesellschaft geschlechtlich unterdrückt wurden, und zugleich die für die weibliche<br />
Kunstproduktion. Darüber hinaus erinnert das Vampir-Motiv durch die Intertextualität<br />
und die metonymischen Deutungsmöglichkeit an die verschiedenen Anderen wie z.B.<br />
Juden. Damit verrät Jelinek, wie die Anderen in der männlichen faschistischen<br />
Herrschaft produziert werden. Dabei stellt sich heraus, dass das vampirische Bild der<br />
Frauen ein Konstrukt der männlichen Projektion und der diskursiven Strategien des<br />
Logozentrismus ist. Hier entsteht das Dilemma, in dem sich die vampirische Existenz
타자성의 구현으로서 흡혈귀성․박은주 63<br />
der Frauen befindet, nämlich das zwischen dem Bild des Anderen des Mannes und<br />
der schwebenden, instabilen Identität der Frauen. Einerseits wird die Frau auf das<br />
durch die männliche Projektion verkehrte Bild festgelegt. Aber andererseits weist die<br />
vampirische Existenz auf das unrepräsentierbare 'Dazwischen' hin, das die Identität<br />
und Subjektivität demontiert. Aber gerade in diesem Dilemma eröffnet Jelinek die<br />
Risse zwischen dem männlichen projektiven Frauenbild und der außer dem Symbolischen<br />
‘irgendwo‘ existierenden realen Frau.<br />
Am Ende des Dramas werden die Vampirinnen als Doppelgeschöpf von den<br />
Männern erschossen. Nach dem Tod der Frauen müssen die Männer auch Vampire<br />
werden, und das bedeutet, dass die männliche Existenz durch die Verneinung des<br />
Anderen auch zerstört werden muss, und dass die männliche Identität ins Wanken<br />
geraten muss. Jelinek stellt mit dem Vampir-Motiv die Ambiguität der Grenze<br />
zwischen dem Gleichen und dem Anderen und die Ungerechtigkeit des Ausgrenzungs-<br />
mechanismus dar. Kurz gesagt, die Ausgrenzung des Anderen führt zu der Zerstörung<br />
oder dem Monströs-Werden des Menschen.<br />
주제어: 타자(성), 제외메커니즘, 흡혈귀주의, 그 사이, 여성의 장소부재성, 남성의 투사, 동<br />
일자와 타자의 경계의 애매성<br />
Schlüsselbegriffe: das Andere, Ausgrenzungsmechanismus, Vampirismus, Dazwischen,<br />
Ortlosigkeit der Frauen, die männliche Projektion, Ambiguität der Grenze<br />
zwischen dem Gleichen und dem Anderen<br />
필자 E-Mail: mayajoo@yahoo.co.kr<br />
투고일: 2009.9.30 / 심사일: 2009.10.22 / 심사완료일: 200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