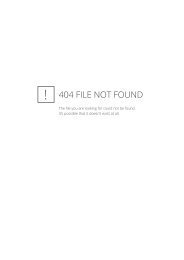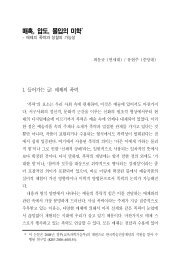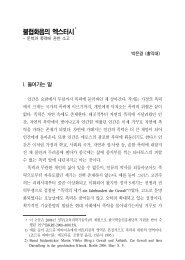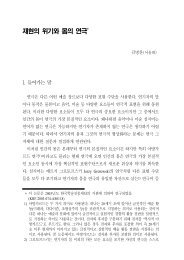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심미적</strong> <strong>기억과</strong> <strong>연극</strong>․<strong>김영목</strong> 85<br />
로 바꾸어놓는 완벽한 역할을 통해 암시적으로 남아 있다. 완벽하게 연기된 역<br />
할은 이미 의미가 부여된 채 관객 반응을 묶어놓는다. 하지만 역할인물이 포기<br />
되거나 연기자와 역할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신체는 자신의 침묵과 가능성의 요<br />
소로서 가시화된다. 이제 <strong>연극</strong> 내용의 습득은 더 이상 사건을 통해 관객에게 수<br />
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 스스로에게 맡겨진다. 이로써 수용상황에서 관객의 독<br />
자적 작업이 부각된다. 자료성과 의미가 붙은 기호의 긴장의 장에서 신체는 관<br />
객에게 자신의 판타지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착상의 통로로 기능한다. 그로써<br />
신체는 일반화된 신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특수한 몸으로 읽혀지고 해독할<br />
수 있게 된다. 신체는 이 신체를 통해 기억의 형상체로 작용되고 생성되는 새 기<br />
억 이미지들의 장소가 된다. 역할과 연기, 신체와 비(比)연기는 이것들의 작용으<br />
로 관객을 무대사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함시킨다. 여기서 자아 상태에 대한<br />
라캉의 설명을 따른다면, 판타지에서 자아형성은 ‘갑옷’이나 ‘굳건한 진영’으로<br />
상징화되는 반면, 판타지의 다른 면은 신체의 파편화로 드러난다. 47) ‘역할’이 이<br />
것에서 확정되는 고정된 자아를 전제로 한다면, ‘신체’는 자신의 파편화를 이중<br />
성으로 드러낸다.<br />
무대가 가시성의 장(場)이라면, 여기서 조각난 파편화의 판타지는 말 그대로<br />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가시화된, 전체로서의 신체는 무대에서 끊임없이<br />
파편화된 비가시적 신체와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가시성은 이<br />
것이 가시성에서 표현을 이탈시키면서 가시성을 이중화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br />
무대의 신체 이미지의 ‘조각화’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무대 의상은 개개의<br />
신체 부분들을 공간 부분들처럼 숨기거나 강조할 수 있다. 또 등장하고 퇴장하<br />
는 방식이 관객의 시야로 들어온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부분들에 대한 단편화<br />
되고 파편화된 가시성이며, 이 단편적 가시성은 신체에서의 일종의 ‘공백’으로<br />
투영에 의해 관객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조각조각 단편화된 신체 이미지는 매끄<br />
러운 거울이미지 속에 하나의 얼룩을 기록하게 된다. 바로 이 얼룩이 그 이미지<br />
에서 ‘완결성’을 이탈시키면서 상상력에서 가시화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접근을<br />
가능케 한다. 표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기억은 유발된 판타지를 통해서만 나<br />
47) Vgl. J. Lacan: a. a. O., S. 64f.<br />
86 뷔히너와 현대문학 26<br />
타날 수 있다. 이때 이 판타지는 기표자료를 완전히 포함시킬 수가 없는데, 왜냐<br />
하면 신체의 기표자료는 특수한 것으로서 항상 지속되어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br />
러한 관계에서 유발되는 긴장이 <strong>심미적</strong> 경험의 ‘잉여’를 규정한다.<br />
심미성과 연관된 신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br />
즉 자료로서 형성된 신체의 기능을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표현이 가능<br />
하게 되며, 그로써 기억만 될 수 있는 이중성, 즉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의 작용과 인식에<br />
중요한 이중성에 대한 표현이 열리게 된다. 48) 여기서 신체 영역은 <strong>연극</strong>의-수사학<br />
적-기억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strong>연극</strong> 자료’ 49)인 신체와 <strong>연극</strong>의 특<br />
수한 관계가 강조될 수 있다. 말하자면 <strong>연극</strong>은 신체의 수수께끼 같은 ‘아우라’를<br />
기억해내며, 이 신체의 상처 저편에서 공동체는 일종의 상흔처럼 전체로서 연결<br />
된다. 또는 캄퍼 D. Kamp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회적인 것의 중요한 실체”로서<br />
신체는 사회적 담론이 제외한 것을 기억한다. 50) 사실 동일성을 창출하는 의식이<br />
란 언제나 사자(死者)들의 무덤 저편에서 벌어진다. 여기서, 시모니데스가 폐허더<br />
미에서 ‘독특한’ 이름 맞추기로 죽은 자들을 산 자들에게 되돌려준 저 기억술의<br />
전설을 떠올려보자. 이 기억술을 <strong>심미적</strong>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질서와 의<br />
미라는 것은 결국 항상 희생자들의 침묵 및 이질성과 결부되어 있다.<br />
48) 신체에서 기호학 이론과의 차이도 분명해진다. <strong>연극</strong>기호학자 피셔 리히테는 <strong>심미적</strong> 텍스<br />
트의 구성과 관련해서 배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배우는 자신의 신체를, 이것이<br />
관객에게 […] 인지될 수 있는 한, 기의로 끌어올려야 하고 모든 비의미를 의미로 변화<br />
시켜야 한다. 배우의 개인적 신체성은 그런 식으로 하나의 상징적 질서로 바뀌어야 한<br />
다.”(E. Fischer-Lichte: Semiotik des Theaters Band 3: Die Aufführung als Text. Tübingen<br />
1983, S. 29)<br />
49) ‘<strong>연극</strong>자료’인 신체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도 참조하라. Antonin Artaud: Das Theater<br />
und sein Double, Frankfurt/M. 1979; Henri Bergson: Materie und Gedächtnis: Eine<br />
Abhandlung über die Beziehung zwischen Körper und Geist, Hamburg 1991; A. Assmann:<br />
Die Sprache der Dinge. Der lange Blick und die wilde Semiose. In: Hans Ulrich Gumbrecht<br />
u. K. Ludwig Pfeiffer(Hg.): Materialität der Kommunikation, Frankfurt/M. 1988, S. 237~<br />
251; Volker Bohn (Hg.): Bildlichkeit, Frankfurt/M. 1995; Dietmar Kamper: Das Phantasma<br />
vom ganzen und vom zerstückelten Körper. In: D. Kamper u. Christoph Wulf(Hg.): Die<br />
Wiederkehr des Körpers, Frankfurt/M. 1982, S. 125~136.<br />
50) D. Kamper: a. a. O., S. 134f. 캄퍼에 따르면 “전체적인 신체는 파편화된 신체와 함께 주어<br />
진 죽음과 성의 전율에 대한 힘겨운 작업의 결실이다.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가장 오래된<br />
지혜와 가장 새로운 지혜 사이의 가교가 놓아져야 한다-이것이 무력화된 미(美)를 대가로<br />
살아있는 것의 연속성에 도달하는 환영(幻影)의 형식을 통해 일어나든 말이다.”(eb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