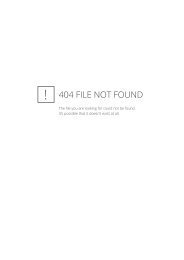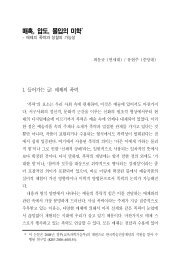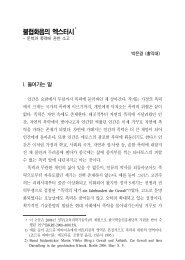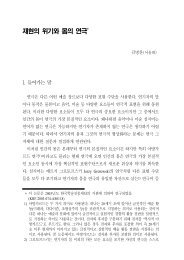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strong>심미적</strong> <strong>기억과</strong> <strong>연극</strong>․<strong>김영목</strong> 65<br />
식에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텍스트의 명시적 내용 이면에 내재<br />
되어 있어야 했던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부각시키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오늘<br />
날 변화된 매체상황과 전자매체에 대한 <strong>연극</strong>의 경쟁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의<br />
테제인 심미성은 특히 기억의 기본형식들인 반복과 배가의 방식에서 정당화될<br />
수 있다. 따라서 기억은 여기서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재현을 문제시하<br />
는 상상과 허구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생산적 상상력으로서<br />
의 기억이 수용과정에서 부각된다. 본고는 ‘재현’으로서의 기존 <strong>연극</strong> 3)을 완전히<br />
부정하기보다는 이 ‘재현 <strong>연극</strong>’을 문제화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심미화하려는<br />
이론적 시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학적, 기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기존<br />
<strong>연극</strong>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어 <strong>연극</strong> 생산 및 수용의 측면에서 <strong>기억과</strong> 연<br />
극이라는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의 상관성을 고찰함으로써 <strong>연극</strong>의 <strong>심미적</strong> 기능에 대한<br />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strong>연극</strong>의 필수 구성요소인 배<br />
우의 신체와 관련해서 기억 개념을 <strong>심미적</strong> 카테고리로서 조명할 것이다.<br />
II. <strong>연극</strong>의 이론: <strong>연극</strong>사회학과 <strong>연극</strong>기호학을 중심으로<br />
<strong>연극</strong>사회학적 관점에서는 특히 <strong>연극</strong>과 사회의 상호작용 관계가 강조된다. 이<br />
때 <strong>연극</strong>은 “이 자체가 인간 상호작용에 대한 모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세<br />
계의 메타포” 4)로 나타난다. <strong>연극</strong>과 사회의 이러한 유사성은 사회적, <strong>연극</strong>적 행<br />
위를 구조화하는 ‘역할’에 대한 공동의 표상에, 그리고 사회상황에 대한 <strong>연극</strong>적<br />
요소들에 토대를 두고 있다. <strong>연극</strong>은 관객에게 사회적 과정을 보여주며 이 과정<br />
을 반복한다. 그래서 <strong>연극</strong>은 사회적 예술형식으로 정의된다. 5) 여기서 <strong>연극</strong>의 관<br />
3) 기존 재현<strong>연극</strong> Repräsentationstheater의 기능은 슈바브에 따르면 “교양, 긴장해소 및 향<br />
유”(G. Schwab: a. a. O., S. 45)에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로는 현대 예술작품이 설명될<br />
수 없다. 현대 <strong>연극</strong>예술은 텍스트의 표현 내지 재현 영역보다는 그 구조적 작용 영역에서<br />
파악된다. 이 재현극에서는 미적 텍스트의 잠재적 의미가 독자적 현상으로 부각되는 대<br />
신,-일상의 방향성과의 유사성으로서-관객이 긴장을 해소하도록 무대에 일련의 동일화 자<br />
극(예컨대 ‘두려움’과 ‘연민’)이 제공된다.<br />
4) Uri Rapp: Handeln und Zuschauer: Untersuchungen über den theatersoziologischen Aspekt in<br />
der menschlichen Interaktion, Dramstadt 1973, S. 31.<br />
66 뷔히너와 현대문학 26<br />
심사는 소통관계로서의 인간 상호작용이며, 이것이 <strong>연극</strong>의 의미를 규정한다. 관<br />
객은 <strong>연극</strong>상황의 인위성을 수용하면서 공동체험을 통해 자신의 경험영역을 확<br />
장시키는 “환영 속에” 6) 있으며 동시에 거리를 갖고 자기 경험을 체험한다. <strong>연극</strong><br />
적 소통의 핵심요소인 이 ‘환영’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와 역할이다. 이 행<br />
위와 역할은 사회적 행위의 모방과 사회적 역할의 연기라는 미메시스 측면에 고<br />
정되어 있다. 여기서 역할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유형화 Typisierung’ 7)로 파악<br />
되어, 상호작용 관계에서 미리 방향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strong>연극</strong>은 <strong>연극</strong>사회학적<br />
관점에서 역할 상호작용을 상징화한다. 게다가 무대와 관객공간의 상호작용을<br />
통해 무대의 상호작용이 배가되면서 배우의 관점도 자기 역할 그리고-배우에<br />
대한 관객의 관점을 통해-다른 배우의 역할들로 이중화된다. <strong>연극</strong>사회학에서는<br />
이 미메시스 측면이 <strong>연극</strong>의 메타소통적 요소 8)로서 <strong>연극</strong>의 예술성을 규정하고<br />
있다. 여기서 미메시스는 탈실용성이 부각되는 <strong>심미적</strong> 예술의 본질적 행위로서<br />
간주된다. 그래서 일상현상은 모방의 반복을 통해 거부되고 직접적인 지시의 중<br />
지를 통해 <strong>심미적</strong> 관계로 변화된다. 그런데 이러한 <strong>연극</strong>의 정의로는 <strong>심미적</strong> 현<br />
상으로의 <strong>연극</strong>이 (영화, 문학 등) 다른 예술들과 구분될 수 없다. 게다가 <strong>연극</strong>사<br />
회학적 관점에서는 <strong>연극</strong>의 특수성은 이것이 ‘역할’의 사회적 범주로 소급될 때<br />
만 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로서의 <strong>연극</strong>의 독자적 심미<br />
성이나 잠재적 작용이 간과된다.<br />
우리는 이미 러시아 형식주의나 구조주의 이론을 통해 예술이란 우리의 이해를<br />
‘낯설게’ 하고 탈자동화하는 ‘방식’, 즉 기본 원칙이 반복에 있는 과정 내지 진행<br />
의 구조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반복은 텍스트의 결합소 Syntagma를 구조화함<br />
으로써 (다의적인) 기호들의 실용적 콘텍스트를 부정한다. 9) 그러나 역할을 강조<br />
하는 <strong>연극</strong>론에서는 예술의 부정성 Negativität, 즉 수용과정에서 콘텍스트의 부정<br />
5) Vgl. ebd., S. 31 u. 39.<br />
6) Ebd., S. 75.<br />
7) Vgl. ebd., S. 92.<br />
8) Vgl. ebd., S. 115.<br />
9) Vgl. Viktor Sklovskij: Kunst als Verfahren. In: Jurij Striedter(Hg.): Russischer Formalismus,<br />
München 1981, S. 3~35. 다양한 미적 이론들에서 나타난 ‘과정적 실행’으로서의 심미성의<br />
기본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hristoph Menke: Die Souveränität der Kunst:<br />
Ästhetische Erfahrung nach Adorno und Derrida, Frankfurt/M.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