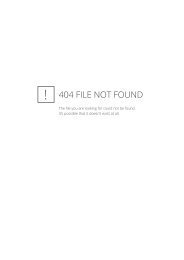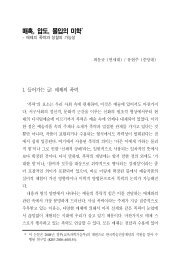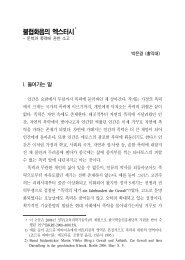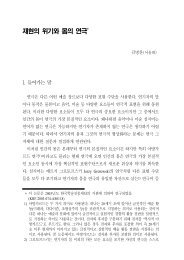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심미적 기억과 연극 김영목 (연세대) - 한국뷔히너학회
Create successful ePaper yourself
Turn your PDF publications into a flip-book with our unique Google optimized e-Paper software.
<strong>심미적</strong> <strong>기억과</strong> <strong>연극</strong>․<strong>김영목</strong> 73<br />
이 감각성과 의미의 변증법적 작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br />
기억, 상상력, 심리적인 요소가 상호 유사성을 띤다. 기억은 특히 생산적인 상상<br />
력과 흡사한 관계에 있는데, 이는 기억이 기억해내는 것이 기억하기 전에는 존<br />
재하지 않았고 기억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기억은 표<br />
현된 것은 오직 표현 순간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strong>연극</strong>의 카테고리<br />
와 상응하게 된다. 그럼 이러한 비(非)선행적 기억의 모순을 어떻게 이론적으로<br />
규정할 수 있는 가? 여기서는 본고의 논거와 접점을 찾기 위해 해당 기억이론에<br />
대한 개괄적 설명이 선행될 것이다.<br />
III. 심미성과 기억의 이론<br />
기억은 이것이 기표와 기의의 틈에서 텍스트의 모방을 일종의 ‘자기준거성’에<br />
서 실재의 모방으로 변화시키는 ‘지시없는 지시대상’으로 드러남으로써 <strong>심미적</strong><br />
실행에 모순을 드러낸다. 그래서 기억은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의 재현이라는 문제와 결<br />
부된다.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는 이것이 표현하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br />
없었던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strong>심미적</strong> 카테고리로서의 기억은 표현의 위기를 나<br />
타내는데, 이는 이것이 인간 상호작용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드러냄으로써<br />
재현의 한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억은 일상적 의미와는 다르게 이해<br />
될 때, 즉 기억을 <strong>심미적</strong> 기억으로 간주해서 <strong>연극</strong>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킬 때,<br />
허구의 <strong>심미적</strong> ‘잉여’로 나타날 수 있다. 일상어의 의미에서 기억은 사회적 과정<br />
의 연속성이나 개인 삶의 정체성 또는 시민적 주체성의 정체성에 대한 보증으로<br />
기능한다. 반면에 기억이 <strong>심미적</strong> 원칙으로 된다면, 정체성과의 단순한 일대일<br />
대응을 해체한다. 즉 <strong>심미적</strong>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을 기억으로<br />
다시 현재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것을 옛 흔적들에서 ‘새롭게’ 창조해내는<br />
것이다.<br />
환원될 수 없는 상상을 유발하는 이 허구성의 계기가 고대 수사학에서 출발<br />
하는 기억이론에 들어 있다. 따라서 기억의 허구성은 기억이론 자체에서 도출될<br />
수 있다. 여기서 기억은 존재와 가상 사이의 환상,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br />
74 뷔히너와 현대문학 26<br />
고 새로운 작용을 야기하는 환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어떻게 <strong>심미적</strong> 텍스트에<br />
서 자료와 의미의 틈이 기억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을까? 앞서 살펴본 <strong>연극</strong>론들<br />
에는 의미 체계의 틈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억개념이 빠져있기에 심미성의 문제<br />
에 흡족한 답을 줄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특히 <strong>심미적</strong> 방식과 성찰에 중요한 기<br />
억개념으로 미셀 푸코의 ‘대항기억 Gegen-Gedächtnis’ 개념이 차용된다. 21) 이 개<br />
념은 기억의 거대한 연속성에서 제외되고 배제된 것, 표현될 수 없는 것, 이탈된<br />
것을 드러내고자하는 일종의 기억 형태를 가리킨다. 푸코는 ‘대항기억’의 개념<br />
을 통해 진화론적이고 단선적인 단순 인과관계에서 규정된 역사과정의 시각에<br />
대항하는 다른 종류의 역사기술을 추구한다. 그로써 우연적 요인들로 취급된 미<br />
세한 일탈들이 만들어낸 단절과 불연속의 변두리 포지션에 주목한다. 여기서 역<br />
사적 사건들은 ‘기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역사적 연속성이나 직접적인 전형이<br />
없는, 미세한 일탈들이 만들어내는 무수한 불연속적 단수들이다. 결국 역사적<br />
사건들은 의미가 사회적 실행에 대한 연관성을 발견할 때까지 오래 동안 중지되<br />
어 있는 빈 형식들이 된다. 이것이 바로 푸코가 ‘대항기억’으로 파악하려는 의미<br />
체계에서의 하나의 틈이다. 이러한 틈은 <strong>심미적</strong> 실행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br />
그러면 이것이 기억의 문제에서 의미하는 바는, 기억된 것이 현재의, 지금의 형<br />
식을 넘어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억은 여기서 아직 공식화되지<br />
않은 새로운 것의 형식이 되는데, 이 의미는 말해지지 않고 재현되지 않은 것에<br />
서부터만 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억을 기원이나 토대가 없는 기억<br />
으로 규정하고자 한다.<br />
1. 고대 기억술과 기억의 수사학<br />
옛날 옛적 고대 그리스의 한 궁정연회에서 쌍둥이형제 디오스크로가 궁의 주<br />
인에게 분노해서 궁을 매몰시킨 적이 있었다. 연회장이 무너졌고 만물 질서가<br />
파괴되었다. 그러나 이 파괴된 질서는 마침내 시인 시모니데스를 통해 복구될<br />
수 있었다. 말하자면 그는 파괴되기 전에 연회장의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br />
21) Vgl. Michel Foucault: Nietzsche, die Genealogie, die Historie. In: M. Foucault: Von der<br />
Subversion des Wissens, München 1974, S. 83~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