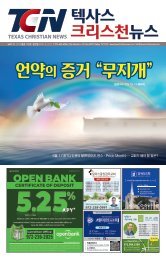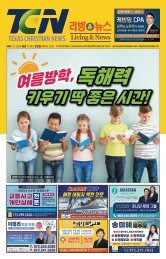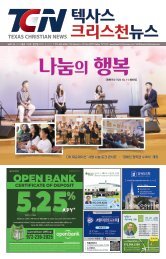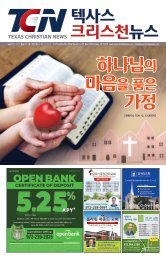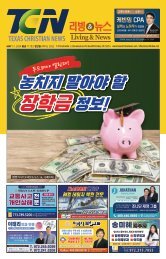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58 | COLUMN KOREA TOWN NEWS • MAR 8 2023<br />
[ 칼럼 ]<br />
이름 짓기<br />
고대진 작가<br />
◈ 제주 출신<br />
◈ 연세대, 워싱턴대 통계학 박사<br />
◈ 버지니아 의과대학 교수,<br />
텍사스 대학 , (샌안토니오) 교수,<br />
현 텍사스 대학 명예교수<br />
◈ 미주 문학, 창조 문학,<br />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br />
◈ 무원 문학상, 미주 가톨릭문학상<br />
◈ 에세이집 <br />
새로 입양한 강아지 이름을 정하려고 이<br />
것저것 생각하다가 꼬리치는 강아지를 보니<br />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아 너는 이제<br />
부터 초롱이다. 초롱아! 부르니 꼬리치며 다<br />
가온다. 그 뒤 초롱이 친구로 입양한 강아<br />
지는 조그만 녀석이 오자마자 큰 초롱이와<br />
밥그릇 싸움하더니 커다란 언니를 압도하려<br />
해서, 야 너는 쌈순이다, 쌈순아! 하고 부르<br />
다 쌈순(Ssamsoon)이 발음을 어려워하는<br />
이곳 사람들을 위해 별명을 ‘쌔씨(Sassy)’<br />
로 붙였다.<br />
적당한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기분이 좋<br />
은 일이다. 고교시절 지역에서 최초로 여학<br />
생들과 혼성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름을 지<br />
을 때 ‘고목( 古 木 )’을 추천했더니 아니 뭔 늙<br />
은이 클럽도 아닌데…라며 주저하는 멤버들<br />
이 많았다. “지란지교( 芝 蘭 之 交 )란 말은 지<br />
초와 난초의 향기로운 사귐을 뜻하는데 이<br />
지초와 난초가 깊은 숲 ‘고목( 古 木 )’의 둥치<br />
에 자란다. 우리가 이 동아리에서 지초와 난<br />
초처럼 맑고 고결한 사귐을 가져야 하지 않<br />
겠냐”고 설득하여 ‘고목’이란 이름을 가진<br />
동아리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다.<br />
대학생 시절 만든 동아리 이름은 ‘목하( 木<br />
下 )’였다. 말 그대로 ‘나무 아래’였는데 연세<br />
대 창립자인 언더우드(Underwood)에서 따<br />
온 이름이다. 이 동아리에서 유신 반대의 토<br />
론을 주최하여 당시 지도교수인 김동길 교<br />
수님과 학생 몇 명이 기관에 잡혀 가서 크<br />
게 곤욕을 치렀다. 그 기관에서 이런 모임<br />
을 만든 저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김동길<br />
교수님이 “이름을 보아라. 나무 아래서 쉬면<br />
서 놀자는 모임이 아니겠냐” 라고 대답했다<br />
고 해서 웃은 적이 있다. 물론 동아리는 해<br />
체당하고 학생들과 지도교수는 징역 6개월<br />
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나무 아래서 치열한<br />
이념 논쟁을 벌였던 목하 동아리의 기억이<br />
새롭다.<br />
이름을 찾아내는 일은 시간이 들지만 보람<br />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오래전 단편소설을 쓸<br />
때였다. 재목이 “고래들의 노래”였는데 사람<br />
이 이민하는 것을 고래가 이민을 가야 하는<br />
일에 비유해서 썼던 이야기다.<br />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 생년월일,<br />
직업 등등을 생각해야 했는데 주인공의 이<br />
름을 “이 민희” 라고 붙였다. ‘이민을 가는<br />
여자’라는 뜻으로 읽히길 바라서 쓴 이름이<br />
다. 이 이름 때문인지 신춘문예 입선작으로<br />
뽑히기도 했다. 다음 소설에서는 ‘민 들레’<br />
라든가 ‘두 루미’ 혹은 ‘가 랑비’라는 순 우리<br />
말의 이름을 가진 주인공도 만들고 싶었는<br />
데 당시 내 박사과정 학생의 이름이 떠올라<br />
평범하게 ‘수민’으로 정했었다.<br />
수학에서도 숫자의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br />
할 때가 있다. 미국의 수학자 케스너(Kasner)는<br />
1938년에 9살 난 어린 조카와 세상<br />
에서 가장 큰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br />
골(googol)과 구골 플렉스라는 이름을 만들<br />
어 냈다. 구골은 1 다음에 0이 100개가 붙<br />
은 수이며 구골 플렉스는 1 다음에 0이 구<br />
골 개 더 붙은 수이다. 유명한 검색 사이트<br />
인 구글(google)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br />
졌다는 의미로 구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려<br />
다 잘못 써서 된 이름이라고 하니, 구골이라<br />
는 이름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큰 수의 이<br />
름이 되었다.<br />
오래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수의 이름을<br />
생각해본다. 일, 십, 백, 천, 만, 억, 조, 경 등<br />
은 모두 한자 말이어서 순수한 우리말 이름<br />
은 아니다.<br />
우리말 수의 이름은 하나, 열, 온 (100), 즈<br />
문 (1000), 골 (10000)이고 잘(억), 울(조)까<br />
지 있다. ‘백’의 우리말이 ‘온’이라는 것을 아<br />
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은 수의 단위로 온<br />
은 쓰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통하는<br />
‘온갖’은 ‘100(온) 가지(갖)’에서 나온 말<br />
이라 한다. 많은 혹은 전부의 뜻으로 온 누<br />
리 혹은 온 세상이라는 단어에도 섞여 있다<br />
고 하니 옛날 온이 아주 큰 수라고 여겼을 때<br />
생긴 말이 아닐까?<br />
‘즈문’은 서정주 시인의 ‘동천’이라는 시에<br />
나오는데 순우리말 수 이름으로 1000을 나<br />
타낸다. 이 말도 거의 사라지고 있지만 ‘내<br />
마음 속 우리 님의 고운 눈썹을/ 즈믄 밤의<br />
꿈으로 맑게 씻어서/…’ 라는 시구에 쓰여 그<br />
이름이 남겨졌다.<br />
‘골’은 만에 해당하는데 이 이름도 옛 시<br />
조에서 볼 수 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br />
번 고쳐 죽어’라는 정몽주의 단심가에서 골<br />
백번은 백만 번을 뜻한다. 한자어로 나온 ‘일<br />
백 번 고쳐 죽어’는 골백번의 잘못된 표기이<br />
다. “골백번 말했는데 아직도 안 했느냐” 등<br />
등의 표현에 남아있는 우리말이다.<br />
억을 뜻하는 ‘잘’은 엄청 많은 혹은 ‘큰’이<br />
라는 뜻으로 쓰였다. ‘잘한다’ 라고 할 때 ‘<br />
잘’은 ‘엄청나게 큰’이란 뜻으로 ‘엄청나게<br />
큰 것을 한다’라는 뜻, 당시 억이란 숫자가<br />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수였음을 짐작하<br />
게 한다.<br />
울은 조(10의 12승, 즉 1에 0이 12개 붙<br />
은 수)에 해당하는 우리 말이다. 지금은 쓰<br />
이지 않는 수의 이름이지만 천도교에서 부<br />
르는 ‘한울’에서의 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br />
다. 한은 크다는 형용사의 옛 우리말. 그러니<br />
‘한울’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존재, 즉 우주라<br />
는 말이 된다.<br />
이름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불러<br />
주는 것도 중요한 듯하다. ‘이름을 불러 주<br />
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네<br />
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br />
되었다’ 라고 노래한 김춘수 시인을 따라 ’<br />
온즈문골잘울’하며 불러본다. 꽃 같이 아름<br />
다운 우리말 숫자들이 나비같이 춤을 추며<br />
날라와 ‘잊혀지지 않는 의미’로 우리 가슴에<br />
앉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