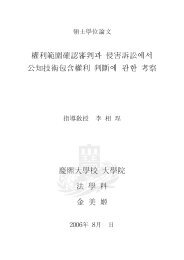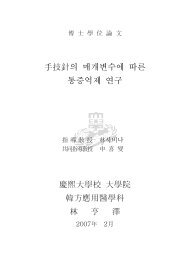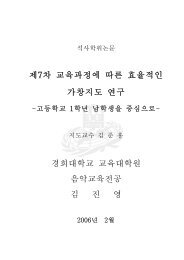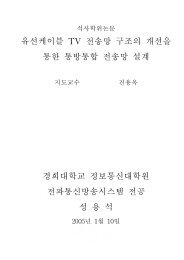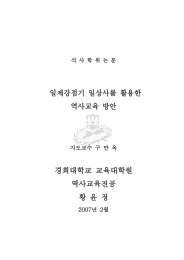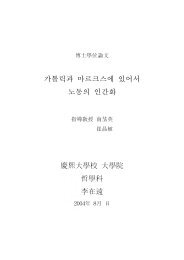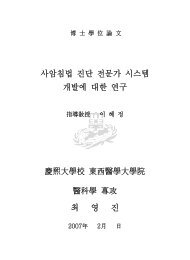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碩士學位論文<br />
<strong>劉向의《說苑》硏究</strong><br />
指導敎授 閔 寬 東<br />
<strong>慶熙大學校</strong> <strong>敎育大學院</strong><br />
<strong>中國語敎育專攻</strong><br />
<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br />
2004년 8월
<strong>劉向의《說苑》硏究</strong><br />
指導敎授 閔 寬 東<br />
<strong>이</strong>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br />
提出함<br />
<strong>慶熙大學校</strong> <strong>敎育大學院</strong><br />
<strong>中國語敎育專攻</strong><br />
<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br />
2004年 8月
<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strong>나</strong>의 敎育學 碩士學位<br />
論文을 認准함<br />
* 主審敎授 (印)<br />
* 副審敎授 (印)<br />
* 副審敎授 (印)<br />
<strong>慶熙大學校</strong> <strong>敎育大學院</strong><br />
2004年 8月<br />
- iii -
目 次<br />
第Ⅰ章. 緖論‥‥‥‥‥‥‥‥‥‥‥‥‥‥‥‥‥‥‥‥‥‥‥‥1<br />
第1節. 硏究 目的 ‥‥‥‥‥‥‥‥‥‥‥‥‥‥‥‥‥‥‥‥1<br />
第2節. 硏究方法 및 硏究範圍‥‥‥‥‥‥‥‥‥‥‥‥‥‥‥3<br />
第Ⅱ章. 成立 背景 및 作家의 生平‥‥‥‥‥‥‥‥‥‥‥‥‥‥‥5<br />
第1節. 成立 背景‥‥‥‥‥‥‥‥‥‥‥‥‥‥‥‥‥‥‥‥‥‥5<br />
(1). 時代的 背景‥‥‥‥‥‥‥‥‥‥‥‥‥‥‥‥‥‥‥‥‥5<br />
(2). 文學史的 背景‥‥‥‥‥‥‥‥‥‥‥‥‥‥‥‥‥‥‥‥7<br />
(3). 思想的 背景‥‥‥‥‥‥‥‥‥‥‥‥‥‥‥‥‥‥‥‥‥11<br />
第2節. 劉向의 生平‥‥‥‥‥‥‥‥‥‥‥‥‥‥‥‥‥‥‥‥13<br />
第Ⅲ章. ≪說苑≫의 內容 分析‥‥‥‥‥‥‥‥‥‥‥‥‥‥‥‥20<br />
第1節. ≪說苑≫에 등장하는 인물의 形象‥‥‥‥‥‥‥‥‥‥20<br />
(1). 君主의 形象‥‥‥‥‥‥‥‥‥‥‥‥‥‥‥‥‥‥‥‥20<br />
(2). 신하의 형상‥‥‥‥‥‥‥‥‥‥‥‥‥‥‥‥‥‥‥‥28<br />
(3). 군자의 형상‥‥‥‥‥‥‥‥‥‥‥‥‥‥‥‥‥‥‥‥33<br />
第2節. 篇目上의 分類‥‥‥‥‥‥‥‥‥‥‥‥‥‥‥‥‥‥‥36<br />
第3節. ≪說苑≫의 思想 分析‥‥‥‥‥‥‥‥‥‥‥‥‥‥‥‥64<br />
(1). 儒敎的 性格‥‥‥‥‥‥‥‥‥‥‥‥‥‥‥‥‥‥‥‥64<br />
1). 仁愛忠孝‥‥‥‥‥‥‥‥‥‥‥‥‥‥‥‥‥‥‥‥65<br />
2). 董仲舒의 思想‥‥‥‥‥‥‥‥‥‥‥‥‥‥‥‥‥‥67<br />
(2). 道家的 性格‥‥‥‥‥‥‥‥‥‥‥‥‥‥‥‥‥‥‥‥75<br />
第Ⅳ章. 體裁 및 描寫技法에 따른 分類‥‥‥‥‥‥‥‥‥‥‥‥79<br />
第1節. 對話體的 記述‥‥‥‥‥‥‥‥‥‥‥‥‥‥‥‥‥‥‥79<br />
第2節. 直述的 記述‥‥‥‥‥‥‥‥‥‥‥‥‥‥‥‥‥‥‥‥82<br />
- iv -
第3節. 引用的 記述‥‥‥‥‥‥‥‥‥‥‥‥‥‥‥‥‥‥‥‥83<br />
第Ⅴ章. ≪說苑≫의 敎訓性과 文學的 價値‥‥‥‥‥‥‥‥‥‥86<br />
第1節. ≪說苑≫에서 보<strong>이</strong>는 敎訓性‥‥‥‥‥‥‥‥‥‥‥‥‥86<br />
(1). 윤리적인 측면의 교훈성‥‥‥‥‥‥‥‥‥‥‥‥‥‥89<br />
(2). 정치적 측면의 교훈성‥‥‥‥‥‥‥‥‥‥‥‥‥‥‥‥89<br />
(3). 교훈성<strong>이</strong> 주는 시사점‥‥‥‥‥‥‥‥‥‥‥‥‥‥‥‥92<br />
第2節. 문학적 가치‥‥‥‥‥‥‥‥‥‥‥‥‥‥‥‥‥‥‥‥93<br />
第Ⅵ章. 結論‥‥‥‥‥‥‥‥‥‥‥‥‥‥‥‥‥‥‥‥‥‥‥‥99<br />
第Ⅶ章. 참고문헌‥‥‥‥‥‥‥‥‥‥‥‥‥‥‥‥‥‥‥‥‥‥103<br />
- v -
第Ⅰ章. 緖論<br />
第1節. 硏究 目的<br />
≪說苑≫은 格言集<strong>이</strong>지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br />
책<strong>이</strong>다. <strong>한</strong> 章 <strong>한</strong> 章, 또 <strong>한</strong> 卷 <strong>한</strong> 卷을 읽다보면 고개가 끄덕여지<br />
고, 요즘의 世態와 비교해 보면 미소를 머금게 하기도 하고 또 <strong>한</strong>숨<br />
<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오게도 하는 그런 책<strong>이</strong>다.<br />
≪說苑≫에는 先秦時期부터 漢<strong>나</strong>라 때까지의 온갖 지혜와 고사들<br />
<strong>이</strong> 담겨져 있다. 읽다 보면 눈에 익은 내용의 고사들도 보<strong>이</strong>는데,<br />
지금 우리<strong>나</strong>라의 중고등 학교의 <strong>한</strong>문 교재<strong>나</strong> 윤리 교과서 등에서도<br />
보았던 <strong>이</strong>야기가 ≪說苑≫에서 유래된 <strong>이</strong>야기들임을 알 수 있다.<br />
≪說苑≫에 등장하는 故事들은 대부분<strong>이</strong> 각 시대를 불문하고 기본<br />
<strong>이</strong> 될 수 있는 유교적 윤리<strong>이</strong>념에 바탕을 둔 <strong>이</strong>야기들<strong>이</strong>다. 예로부<br />
터 우리<strong>나</strong>라에도 유교사상에 깊게 뿌리 박혀 있어서 인지 읽으며<br />
특별히 거부감<strong>이</strong> 들거<strong>나</strong> 납득 할 수 없는 고사는 거의 없다. 요즘과<br />
같<strong>이</strong> 도덕 윤리가 사라지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우리를 지탱해줄 가<br />
치관<strong>이</strong> 사라지고 있는 지금, <strong>이</strong>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경<br />
쟁사회 속에서 내면의 ‘火’를 다스리고 또 지혜를 얻는데도 아주 적<br />
합<strong>한</strong> 책<strong>이</strong>라 보여진다.<br />
≪說苑≫ <strong>이</strong>란 책은 참으로 유쾌<strong>한</strong> 풍자와 은유로 <strong>이</strong>루어져 옛사<br />
람들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說苑≫속에 등장하<br />
는 고사들<strong>이</strong> 지닌 교훈성과 그뿐 아니라 고사들의 문학적 가치와<br />
≪說苑≫의 문학사적인 지위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br />
≪說苑≫의 故事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br />
- 1 -
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 개중에는 잘 알려진 故事들도 있지만 일반<br />
적으로 ≪說苑≫<strong>이</strong> 중국문학을 전공<strong>한</strong> 사람들에게도 즐겨 읽혀지지<br />
않음<strong>이</strong> 매우 애석하게 생각된다.<br />
따라서 本稿에서는 ≪說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br />
해 보고자 <strong>한</strong>다. 또<strong>한</strong> ≪說苑≫<strong>이</strong>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라는<br />
터라 내용상의 분석에 더 힘을 실었음을 미리 말해둔다.<br />
먼저 내용상의 분류를 위해 ≪說苑≫의 故事를 등장하는 인물 유<br />
형별로 <strong>나</strong>눠보았다. 따라서 군주의 형상, 신하의 형상, 군자의 형상<br />
세 부분으로 <strong>나</strong>눠보았다.<br />
≪說苑≫은 20권의 각기 다른 篇目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篇目의<br />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중심 내용<strong>이</strong> 잘 드러난 고사를 예로 들<br />
어보려 <strong>한</strong>다.<br />
또<strong>한</strong> ≪說苑≫의 고사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strong>나</strong>는 사상을 찾아<br />
儒敎的인 성격의 고사와 道家的인 성격의 고사들로 <strong>나</strong>눠 분류하고<br />
자 <strong>한</strong>다. 그리고 劉向의 사상과 철학에 根幹<strong>이</strong> 된 董仲舒의 사상을<br />
살펴보고자 <strong>한</strong>다.<br />
≪說苑≫에 등장하는 800餘篇의 고사들을 또<strong>한</strong> 묘사기법에 따라<br />
<strong>나</strong>눠보려 하는데 對話體的 記述方法과 直術的 記述, 引用的 記述 <strong>이</strong><br />
렇게 3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하려 <strong>한</strong>다.<br />
<strong>이</strong>렇게 내용과 체제를 분석하여 중국문학사에서 ≪說苑≫<strong>이</strong> 차지<br />
하는 위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strong>한</strong>다. 그러기 위해 ≪說苑≫의 교훈성<br />
과 소설사적 의미와 특징에 대하여 증명하는 작업<strong>이</strong> 꼭 필요하리라<br />
생각<strong>한</strong>다.<br />
따라서 本稿에서는 고사의 내용<strong>이</strong> 포함하고 있는 敎訓性을 윤리적<br />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strong>나</strong>눠보고 교훈성<strong>이</strong> 주는 시사점을 밝혀 보<br />
고자<strong>한</strong>다. 제후국의 제후<strong>나</strong> 작은 <strong>나</strong>라의 왕도 모두 왕으로 포함을<br />
시켰으며 공자와 제자, 그리고 기타 다른 사람들의 경우 출현 빈도<br />
- 2 -
수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골랐음을 미리 말해둔다.<br />
또, 각 고사에선 어떠<strong>한</strong> 사상<strong>이</strong> 밑바탕에 깔려있는가를 보고 ≪說<br />
苑≫의 사상을 잘 드러난 고사를 찾아 예를 들어 보려 <strong>한</strong>다.<br />
마지막으로 ≪說苑≫설원<strong>이</strong> 중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br />
보고 소설사적으로는 어떠<strong>한</strong>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려 <strong>한</strong>다.<br />
第2節. 硏究 方法및 硏究範圍<br />
<strong>이</strong>전의 ≪說苑≫에 대<strong>한</strong> 연구는 매우 미미<strong>한</strong> 수준<strong>이</strong>다. 中國 文學<br />
史 魏晉南北朝 부분에서도 志怪小說과 志人小說 1)에 대해 설명하며<br />
書名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 자세<strong>한</strong> 설명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br />
<strong>이</strong>다.<br />
그 외 학위 논문으로 林明花,〈≪說苑≫의 語法構造 硏究〉, 1998<br />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을 찾을 수 있지만 本稿에서 관심을<br />
갖고 분석하고자 하는 ≪說苑≫의 전체적인 내용<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체제에 대<strong>한</strong><br />
설명보다는 ≪說苑≫의 어법구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br />
다시 말해 ≪說苑≫자체의 내용<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체제에 대<strong>한</strong> 연구는 거의 성<br />
과가 없는 편<strong>이</strong>라 말 할 수 있다.<br />
하지만 846章에 달하는 고사들<strong>이</strong>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며 유교 윤<br />
리 <strong>이</strong>념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에도 크게 알려진 바<br />
가 없음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strong>이</strong>를 각 卷마다 내용을 정리하였고<br />
1) 志人小說<strong>이</strong>란 명칭은 魯迅<strong>이</strong> 〈中國小說的歷史的變遷〉第 2講 〈六朝時之志<br />
怪與志人〉<strong>이</strong>라는 글에서 맨 처음 사용<strong>한</strong> 것으로 “志怪”와 상대적인 의미에<br />
서 만들어낸 신조어<strong>이</strong>다. 노신 <strong>이</strong>후 대부분의 중국문학사와 소설사에서 魏<br />
晉南北朝 소설을 분류할 때 <strong>이</strong>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에 따라<br />
서는 軼事小說, 人物軼事小說, 淸言小說, 淸談小說 등으로 칭하기도 <strong>한</strong>다.<br />
김장환, 〈魏晉南北朝 志人小說 硏究〉,1992, 延世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br />
- 3 -
또 篇目가운데 그 篇目의 주제와 내용을 잘 드러내는 고사를 예를<br />
들어, 고사들<strong>이</strong> 묘사하고 있는 것<strong>이</strong> 무엇인지 분석하여 고찰해 보려<br />
<strong>한</strong>다.<br />
그 외 譯註文으로 劉向 著 林東錫 譯註, 1992, ≪說苑≫上․下 東文<br />
選<strong>이</strong> 있다. 본고에서는 <strong>이</strong>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내용과 체제를 분<br />
석하였음을 밝혀 둔다.<br />
<strong>이</strong> 譯註文은 총 상․하 2권으로 <strong>이</strong>뤄졌으며 고사들은 예를 들어<br />
1卷 「王道」편 처음 고사라면 1-1<strong>이</strong>라는 번호를 갖는데 <strong>이</strong>렇게 20<br />
卷 「反質」편까지 각각의 고사들을 정리하였다. 각 故事들은 원문<br />
<strong>이</strong> 先述되고 뒤에 譯註를 달았다.<br />
그리고 ≪說苑≫에 대<strong>한</strong> 연구 논문<strong>이</strong> 매우 미비<strong>한</strong> 관계로 그 시기<br />
에 <strong>나</strong>온 志怪小說에 관<strong>한</strong> 논문과 志人小說로서의《世說新語》에 대<br />
<strong>한</strong> 논문을 참고하였다.<br />
- 4 -
第Ⅱ章. 成立 背景 및 作家의 生平<br />
第1節. 成立 背景<br />
(1). 시대적 배경<br />
문학<strong>이</strong>란 장르가 시대상과 사회적 분위기를 벗어<strong>나</strong> 존재<strong>한</strong>다는<br />
것은 불가능 할 것<strong>이</strong>다. 다시 말해 문학 작품<strong>이</strong>란 시대를 반영하는<br />
것<strong>이</strong>기에 그 작품을 <strong>이</strong>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와 사회 상황 그리<br />
고 당시를 지배<strong>한</strong> 사상을 <strong>이</strong>해하는 것은 당연<strong>한</strong> 일일 것<strong>이</strong>다. ≪說<br />
苑≫도 마찬가지여서 다른 어떤 작품보다 時代思想的 영향을 받았<br />
다고 할 것<strong>이</strong>다.<br />
始皇帝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결짓고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가혹<br />
<strong>한</strong> 정치를 행하고 분서갱유까지 실시하여 어떤 문화<strong>나</strong> 문학을 형성<br />
할 겨를<strong>이</strong> 없었다.<br />
그의 절대적인 권력은 始皇帝라는 <strong>이</strong>름에서도 잘 <strong>나</strong>타난다. <strong>이</strong>전의<br />
王<strong>이</strong>란 명칭을 거부하고 神的인 존재를 부르던 帝로 불리길 원했다.<br />
진시황은 중앙집권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법가 정책을 실제 정치에<br />
서 시행하였다. <strong>이</strong>렇게 강압적인 정치는 후에 반란을 야기 시킨 원<br />
인<strong>이</strong> 되기도 <strong>한</strong>다.<br />
秦에 대<strong>한</strong> 반란군으로 다른 장수들을 제압<strong>한</strong> 유방은 漢 高祖가 된<br />
다. 漢<strong>나</strong>라는 대부분 秦의 제도를 계승하였으<strong>나</strong> 진과는 다르게 민생<br />
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漢 初에는 유가와 법가 2개의 정치<br />
사상<strong>이</strong> 공존하였으<strong>나</strong> <strong>나</strong>라가 기틀을 잡아가면서부터 가혹<strong>한</strong> 법가<br />
- 5 -
사상을 버리고 백성들<strong>이</strong> 편히 살만<strong>한</strong> 정치를 하기에 힘썼다. 고조의<br />
뒤를 <strong>이</strong>은 惠帝를 대신해 呂后가 실권을 잡아 <strong>이</strong>후로 외척<strong>이</strong> 권력<br />
을 장악할 수도 있었으<strong>나</strong> 朱虛侯등<strong>이</strong> 呂氏일족을 몰아내 劉氏정권<br />
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리고 고조의 서자였던 劉恒<strong>이</strong> 제위에 올랐<br />
는데 <strong>이</strong>가 바로 文帝<strong>이</strong>다.<br />
文帝와 5대 景帝의 어진 정치를 거치며 <strong>한</strong><strong>나</strong>라는 경제력과 국력<strong>이</strong><br />
안정되어졌다. 文帝는 스스로 검소<strong>한</strong> 생활을 하며 농업을 장려하여<br />
농민의 세금을 감하였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제도는 후에 대토지 소유자<br />
가 탄생하고 일반 소작 농민들과의 엄청난 소득 격차가 생기는데<br />
일조 하기도 <strong>한</strong>다. 또<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것은 지방 호족의 생성을 의미하기도 하<br />
는 것<strong>이</strong>다.<br />
景帝의 뒤를 <strong>이</strong>은 武帝는 정치 사회 경제상의 안정을 <strong>이</strong>어 받아<br />
앞서 말<strong>한</strong> 문제점들을 다스릴 治國의 방법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강<br />
화하고 지방에 대<strong>한</strong> 통제권을 강화<strong>한</strong>다. 그리고 董仲舒의 건의에 따<br />
라 유학을 정치<strong>이</strong>념으로 받아들여 사상적, 문화적으로 통일하기에<br />
힘썼다. 즉 안정을 통하여 중앙 집권 체제로 왕권을 더욱 강화해 <strong>나</strong><br />
갔다.<br />
그러<strong>나</strong> 漢武帝 <strong>이</strong>후 外戚<strong>이</strong> 정치에 간섭하게 되면서 혼란기로 접<br />
어들게 되는데 宣帝, 元帝, 哀帝로 <strong>이</strong>어지는 대략 100년간은 외척의<br />
전성기가 된다.<br />
劉向은 전<strong>한</strong> 말기의 사람으로 외척과 환관에 의해 매우 어려운 때<br />
를 살았던 인물로 그의 사후 13년 만에 외척에 의해 前漢<strong>이</strong> 막을<br />
내리고 後漢<strong>이</strong> 시작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strong>한</strong>사람의 선비<strong>이</strong>자 유학<br />
자<strong>이</strong>기 전에 황실의 자손으로 <strong>나</strong>라를 바라보았던 유향의 마음<strong>이</strong> 어<br />
떠하였는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br />
따라서 유향은 외척과 환관으로 인해 어지러워진 君臣關係를 바로<br />
잡고 땅에 떨어진 왕권을 되찾기 위해 <strong>이</strong>전의 서적과 역사 사료들<br />
- 6 -
중 유교<strong>이</strong>념과 온전<strong>한</strong> 군신관계의 모습<strong>이</strong> 드러난 고사를 찾아 묶어<br />
≪說苑≫을 저술<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라 생각<strong>한</strong>다.<br />
(2). 文學的 背景<br />
문학적으로 漢代는 詩歌와 散文<strong>이</strong> 본격적으로 발달<strong>한</strong> 시기<strong>이</strong>다.<br />
시가에는 賦라는 <strong>한</strong>대 특유의 문학양식<strong>이</strong> 출현하였으며 司馬相如,<br />
班固등 作家라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strong>이</strong> 상당수 등장<strong>한</strong>다. <strong>한</strong>대시가<br />
를 대표하는 樂府詩는 武帝가 설립<strong>한</strong> 관청인 樂府의 활동에서 비롯<br />
된 것<strong>이</strong>었다.<br />
시가와 더불어 <strong>한</strong>대는 산문의 발달도 두드러지는데 <strong>한</strong>대의 산문은<br />
형태적으로 前시기에 비해 세련되고 양적으로 풍부해졌다. 춘추시대<br />
의 歷史書와 諸子書의 산문적인 전통은 <strong>한</strong>대로 계승되었으며 漢의<br />
문화적 상황 속에서 독특하게 발전하였다.<br />
<strong>한</strong>대산문을 대표하는 저작으로는 역사서인 《史記》,《漢書》가 있<br />
다. <strong>이</strong> 밖에도 前漢의 散文으로는 司馬遷의 《史記》를 비롯하여 董<br />
仲舒의《春秋繁露》, 劉向의《新書》,《說苑》,《列女傳》등<strong>이</strong> 있다.<br />
후<strong>한</strong>의 산문 가운데는 漢王朝의 興亡盛衰의 과정을 다룬 중국 최초<br />
의 본격적 歷史書인 班固의 《漢書》가 주목할 만하다.<br />
儒學의 철학과 사상은 漢 武帝가 董仲舒의 의견을 받아들여 百家<br />
를 모두 내몰고 유학을 정통학술로 받든 뒤부터 정치제도<strong>나</strong> 사회<br />
풍속 등<strong>이</strong> 모두 六經을 근거로 형성되어 오랜 기간 사람들 가운데<br />
자리하고 있었으므로 하루아침에 그 뿌리가 뽑힐 수는 없었다.<br />
따라서 老莊의 학설<strong>이</strong> 비록 성행<strong>한</strong>다 하여도 당시 학자들은 여전<br />
히 孔子의 聖敎도 존중하였다. 2)<br />
- 7 -
당시의 문인들은 노장사상에 심취해 있으면서도 유교를 완전히 배<br />
척<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그것을 노장의 학설 안으로 들여와 둘의 사상적<br />
조화를 모색하였던 것을 알게 된다. 유학<strong>이</strong> 아무리 쇠퇴하였다 하여<br />
도 근간은 여전히 남아 당시 사회에 보일 듯 보<strong>이</strong>지 않게 상당<strong>한</strong><br />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br />
노장철학은 유학의 학술적인 부패와 정치적으로 가혹<strong>한</strong> 공포정치<br />
와 사회적으로는 大變亂으로 인해 생겨난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의<br />
경향에 부응하여 새로운 철학사상과 정신적 가치관을 제시해 주었<br />
다.<br />
秦始皇은 전국의 도량형을 통일하고 <strong>한</strong>자도 통일하여 정치․경<br />
제․문화면에 있어 지금의 중국<strong>이</strong>란 <strong>나</strong>라의 터전을 <strong>이</strong>룩하였지만<br />
暴政과 焚書坑儒를 감행하여 천하를 통일하였다 하여도 문화라 얘<br />
기할 만<strong>한</strong> 것을 형성할 겨를<strong>이</strong> 없었다.<br />
漢<strong>나</strong>라는 秦<strong>나</strong>라 말기의 피폐를 계승하였으<strong>나</strong> 백성들<strong>이</strong> 편히 쉬며<br />
살 수 있도록 하였고 董仲舒의 건의를 받아들여 儒學을 <strong>나</strong>라의 정<br />
치<strong>이</strong>념으로 받아들<strong>이</strong>게 되었다.<br />
그러<strong>나</strong> 전제 군주 밑에서의 학문<strong>이</strong>란 결국 예교를 내세워 당시의<br />
정치를 돋보<strong>이</strong>게 하는 역할에 지<strong>나</strong>지 않았다. 당시의 학자들은 황제<br />
<strong>나</strong> 귀족의 그늘 아래에서만 생활<strong>이</strong> 가능하였다. 그러니 학자들<strong>이</strong>란<br />
전제군주를 위해 학술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형편<strong>이</strong>었다.<br />
문학 역시 마찬가지여서 漢代를 대표하는 賦만 보더라도 漢 初에<br />
는 전국시대 楚<strong>나</strong>라에서 발생<strong>한</strong> 楚辭 또는 騷體의 賦가 유행하였으<br />
2) 阮修는 훌륭<strong>한</strong> 명성<strong>이</strong> 있었는데 王夷甫가 그를 만<strong>나</strong> 묻기를 : “老莊과 聖敎<br />
가 같은가?” 라고 하자 阮<strong>이</strong> 대답하길 : “거의 같<strong>이</strong> 않을런지요.” 라고 하였<br />
다.<br />
阮宣子有令聞. 太尉王夷甫見而問曰 : ‘老莊與聖敎同異?’ 對曰 : ‘將無同’<br />
《世說新語》〈文學〉18<br />
- 8 -
<strong>나</strong> 武帝때에 <strong>이</strong>르면 황제 주변의 사물을 화려하게 묘사하기에만 힘<br />
쓰는 散體의 長賦가 유행하게 된다. 대표작가인 司馬相如를 비롯<strong>한</strong><br />
賦 作家들은 황제를 따라다니다가 황제의 기분에 따라 부를 지어<br />
올려 황제를 기쁘게 하는 자들<strong>이</strong>었다. 따라서 당시의 문인들은 배우<br />
같<strong>이</strong> 글 짓는 재주로 황제를 즐겁게 하는 자들<strong>이</strong>어서 황제의 분위<br />
기와 맞는 화려<strong>한</strong> 長賦가 유행하였다.<br />
<strong>이</strong>는 후에 <strong>나</strong>타날 唯美主義的 문학풍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br />
漢代 <strong>이</strong>전의 散文은 상소문 중심<strong>이</strong>었으<strong>나</strong> <strong>한</strong>대에 들어서면서 상소<br />
문을 중심으로 <strong>한</strong> 政論文과 전국시대의 역사적 산문을 계승<strong>한</strong> 史專<br />
文의 두 갈래로 크게 발달<strong>한</strong>다. 당시의 사전문은 옛 사람의 逸事를<br />
엮어놓은 책<strong>이</strong>지만 <strong>한</strong>대 산문의 발달을 <strong>이</strong>해하기에 없어서는 안 될<br />
중요<strong>한</strong> 저서들<strong>이</strong>다.<br />
劉向의 ≪說苑≫ 역시 사전문에 속<strong>한</strong>다. 漢代 散文의 대표적 저서<br />
로 司馬遷의 《史記》를 꼽는다. 사마천은 성기를 잘리는 宮刑을 받<br />
게 되고 치욕적인 궁형을 받은 후 《史記》의 저술에만 힘써 130篇<br />
에 달하는 불후의 대작을 <strong>이</strong>룩할 수 있었다. <strong>이</strong>는 사마천의 강<strong>한</strong> 신<br />
념<strong>이</strong> 역사 기록에 강<strong>한</strong> 개성을 불어넣고 있어 역사서로의 객관성은<br />
결여되지만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생동하는 듯<strong>한</strong> 문장을 <strong>이</strong><br />
루고 있다. 《史記》를 紀傳體라 말하는데 《史記》가 중국문학사상<br />
큰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은 本紀<strong>나</strong> 列傳<strong>이</strong> 모두 인물의 기록<strong>이</strong>기 때<br />
문에 후세 전기 문학의 본<strong>이</strong> 되었기 때문<strong>이</strong>다. 사마천의 개성적인<br />
문장<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희극적<strong>이</strong>고 생동하는 듯<strong>한</strong> 표현 방법은 후세 산문은 말할<br />
것도 없고 소설과 희곡 발달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br />
그러<strong>나</strong> 漢의 모든 문학 작품은 말엽으로 갈수록 더욱 변려체에 가<br />
까워지는 경향을 보<strong>이</strong>게 된다. 그들 중에 자기의 사상과 정론 등을<br />
쓴, 수사보다 뜻의 표현<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윤리에 힘을 기울였던 저술들도 많<strong>이</strong><br />
<strong>나</strong>왔으<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것들도 역시 대구가 많고 문장<strong>이</strong> 정제하다.<br />
- 9 -
그리고 先秦의 諸子書 및 史書가 후세 중국의 문학과 역사 전반에<br />
끼친 영향<strong>이</strong> 절대적으로 컸던 만큼 문학사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br />
하겠다. 先秦 제자백가의 산문은 각 사상가와 그 弟子들의 철학과<br />
학술사상 등을 기록<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대부분인데 그러<strong>한</strong> 기록 중에는 인물의<br />
구체적인 언행<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인물의 성격을 생동감 있게 묘사<strong>한</strong> 故事가 많다.<br />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志人故事는 내용상 길고 짧음의 차<strong>이</strong>는 있지만 대개 일정<br />
<strong>한</strong> 주제가 담겨 있고 등장 인물의 형상<strong>이</strong> 두르려지며 내용의 전개<br />
에 있어서도 일정<strong>한</strong> 故事性을 띠고 있는 것<strong>이</strong> 많다.<br />
또<strong>한</strong> 고사에서 사용하는 묘사수법<strong>이</strong> 다양하여 문학적 가치도 높다<br />
고 하겠다. 특히 寓言의 형식으로 <strong>이</strong>루어진 단편고사에서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특<br />
성<strong>이</strong> 강하게 <strong>나</strong>타<strong>나</strong>고 있다 <strong>이</strong>는 선진 제자백가의 산문<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미 志<br />
人小說的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strong>이</strong>다.<br />
《論語》는 공자가 제자들<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당시 사람들과 <strong>나</strong>눈 문답과 제자들<br />
<strong>이</strong> 서로 함께 談論하거<strong>나</strong> 스승에게 직접 들은 말을 기록<strong>한</strong> 것으로<br />
당시 제자들<strong>이</strong> 각자 기록해 놓았던 것을 공자가 죽고 <strong>나</strong>서 서로 모<br />
아 편찬<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실제적인 언행<strong>이</strong> 묘사되어<br />
있다. <strong>이</strong>는 語錄體의 산문으로 언어가 간결하고 함축적<strong>이</strong>다. 간단<strong>한</strong><br />
문장형식으로 <strong>이</strong>루어진 語錄體 산문으로 언어는 간결하지만 거기에<br />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화와 행동을 통하여 인물의<br />
형상을 부각시켰으며 간단<strong>한</strong> 대화와 행동의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br />
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br />
선술<strong>한</strong> 바 있으<strong>나</strong> 외척과 환관의 세력에 의해 정치적 혼란기를 살<br />
아가며 어지러워진 사회질서와 무너진 군신관계를 바로 세우고자<br />
하였던 것<strong>이</strong>다. ≪說苑≫의 고사 가운데 강<strong>한</strong> 왕<strong>이</strong> 있으면 강<strong>한</strong> 대<br />
부가 <strong>나</strong>타날 수 없다는 말<strong>이</strong> 있다. 다시 말해 권력<strong>이</strong>란 양립할 수<br />
없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것은 정치에 대<strong>한</strong> 그의 생각<strong>이</strong> 잘 드러<strong>나</strong>는 부분<strong>이</strong><br />
아닐 수 없다. 그는 황손의 <strong>한</strong> 사람으로 황실의 장서를 마음껏 볼<br />
- 10 -
수 있었으므로 후세에 본<strong>이</strong> 될만<strong>한</strong> 인물 고사들을 추려 <strong>한</strong> 권으로<br />
묶어 ≪說苑≫으로 탄생시켰다.<br />
또<strong>한</strong> 선진세자서와 역사서들의 인물 중심 고사들은 ≪說苑≫의 소<br />
사들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 밑바탕<strong>이</strong> 되었다.<br />
(3). 思想的 背景<br />
漢 제국<strong>이</strong> 세워지고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릴 때의 정치 <strong>이</strong>념을 바로 유학을<br />
택하였던 것은 아니다. 武帝 時代에 <strong>이</strong>르러 무제는 신하들에게 유능<br />
하고 품행<strong>이</strong> 바른 사람을 추천할 것을 말하였다. 무제는 유가사상을<br />
익힌 자를 채용할 생각<strong>이</strong>었다. <strong>이</strong>에 董仲舒가 추천되었으며 오경박<br />
사를 설치하였다. 즉 무제시대에 유가적 소양을 갖춘 인물들의 활동<br />
<strong>이</strong>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br />
漢 初에는 儒家와 法家를 함께 사용하였으<strong>나</strong> 유가적 소양을 갖춘<br />
사람들의 정치적 발언권<strong>이</strong> 점차 커졌던 것<strong>이</strong>다.<br />
유가학설<strong>이</strong>란 춘추시대 말기 공자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사상의 근<br />
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仁의 완성에 목적<strong>이</strong> 있으며 <strong>이</strong>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禮가 숭상되<br />
었다. <strong>이</strong> 예의 밑바탕에는 조상에 대<strong>한</strong> 제사를 중심으로 <strong>한</strong> 동족의<br />
식<strong>이</strong> 깔려있다.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동족 의식은 鄕黨的 결합의식으로 변화하였<br />
고 촌락 안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확대되었다. 따라서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의식<strong>이</strong><br />
매우 일반화되어 지방질서를 유지하던 것<strong>이</strong> 점차 중앙에 반영되게<br />
되었다.<br />
사람의 인생에 있어 <strong>한</strong>사람의 스승과 3명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strong>한</strong><br />
인생<strong>이</strong>란 말<strong>이</strong> 있다. 또<strong>한</strong> 자신의 인생을 바꿀 만큼의 영향을 준 스<br />
- 11 -
승<strong>이</strong>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사람<strong>이</strong>라면 그는 매우 행복<strong>한</strong> 사람일 것<br />
<strong>이</strong>다.<br />
요즘 사회적으로 멘토라는 말<strong>이</strong> 매우 유행하고 있다. 지식만을 전<br />
달하는 스승<strong>이</strong>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劉向에<br />
게는 董仲舒가 그러<strong>한</strong> 인물<strong>이</strong>었으리라 생각된다.<br />
동중서는 兩漢 혹은 적어도 西漢을 대표하는 학자임을 부정하는<br />
<strong>이</strong>가 거의 없고 중국 사상사<strong>나</strong> 문학사를 다루는 전문적인 서적에서<br />
도 빠짐없<strong>이</strong> 다루어지는 중요<strong>한</strong> 인물<strong>이</strong>다.<br />
董仲舒는(기원전 179~104)는 서<strong>한</strong> 시대의 유학자<strong>이</strong>며 정치가<strong>이</strong>다.<br />
河北省 廣州사람으로 일생동안 公羊春秋學을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br />
사람들<strong>이</strong> “漢代의 孔子”라 불릴 만큼 사람됨<strong>이</strong> 兼直하였으며 학문에<br />
博通하였다고 <strong>한</strong>다. 현재 남아 있는 동중서의 대표적 저술은 《春秋<br />
繁露》<strong>이</strong>다. 중요사상은 천인관계, 즉 天人感應論<strong>이</strong>다. 그는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천인감응론을 음양오행학설을 통해 더욱 더 체계화, <strong>이</strong>론화 시켰다.<br />
그의 사상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strong>이</strong> 하늘과 감응할 수 있다고 보았<br />
다. 그 <strong>이</strong>유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명을 부여받은 존재<strong>이</strong>며 하늘의<br />
음양지기는 인간에게도 동기로서 존재하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동중서 천인감응론의 실제적 의도는 공자의 《春秋》를 발휘하는<br />
것에 있었다. 그는 《春秋》를 통해 ‘하늘과 인간의 상호 관계지음’<br />
을 말함으로 「奉天法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strong>이</strong> 있었다. 즉 《春<br />
秋》에 기록된 과거역사경험을 통해 하늘의 의지를 살피고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의지를 군왕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실현시키는데 있었다고 할 수<br />
있다.<br />
災異중 <strong>나</strong>타난 천인감응은 강력<strong>한</strong> 천의 의지와 함께 역사의 교훈<br />
<strong>이</strong> 함께 들어 있어 동중서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 천의가 깊<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타<br />
<strong>나</strong>있음 경험하였다. 그는 그러<strong>한</strong> 경험을 통해 자신의 독특<strong>한</strong> 학문<strong>이</strong><br />
- 12 -
론을 세울 수 있었던 것<strong>이</strong>다.<br />
또 災異說은 그의 독실<strong>한</strong> 신념과 신앙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력<strong>한</strong><br />
천의 계시성의 의지를 간과할 수 없다.<br />
그의 사상은 당시의 선진유학과는 차별화된 사상철학으로 당시의<br />
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劉向 역시 마찬가지다.<br />
동중서의 다른 천인감응론과 재<strong>이</strong>설에 대<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는 第3章 3節<br />
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동중서에 대<strong>한</strong> 간단<strong>한</strong> 소개만으로<br />
마치려 <strong>한</strong>다.<br />
第2節. 劉向의 生平<br />
劉向은 前漢 末期의 대학자<strong>이</strong>며 문학가<strong>이</strong>다. 그는 漢 高祖 劉邦<br />
의 <strong>이</strong>복동생 劉交의 四世孫인 劉德의 아들로 皇族<strong>이</strong>다. 본명은 更生<br />
<strong>이</strong>며 자는 子政<strong>이</strong>다. 生卒年代는 대개 BC 77년부터 혹은 BC 6년<br />
혹은 BC 79년부터 혹은 BC 8년으로 보고 있다.<br />
그의 사상은 董仲舒로부터 전수된 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陰陽家,<br />
法家, 墨家 思想들을 보조로 겸하였다. 그의 사상은 그리 엄격하지<br />
는 않았던 듯하다. <strong>한</strong>때는 神仙家에 매료되어 연금술에 심취<strong>한</strong> 적도<br />
있다. 그는 經學․史學․文學․目錄學 등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br />
을 남겼다. 그 중 후세의 학술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공헌으로 평가되<br />
고 있는 것은 독특<strong>한</strong> 방면의 작업인데 그는 황실 도서관에 소장된<br />
모든 서적들을 정리하고 해제를 달아 《別錄》<strong>이</strong>라는 책을 저술하<br />
였다. 그의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분류 의식<strong>이</strong> 여러 저서들의 탄생 배경<strong>이</strong> 되었다<br />
고 생각<strong>한</strong>다.<br />
- 13 -
劉向은 신하로서 漢代의 宣帝, 元帝, 成帝 3代를 내리 섬겼다. 또<br />
능력을 인정받아 20세에 諫大夫로 발탁되었으며 수십 편의 賦頌을<br />
지었다. 宣帝부터 成帝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諫大夫, 中郞, 散騎諫大夫등을<br />
지냈다. 神仙方術에도 관심<strong>이</strong> 많아 黃金鑄造를 주장하였으<strong>나</strong> 실패하<br />
여 <strong>한</strong>때 황제의 노여움을 사 여러 차례 하옥되기도 하였다. 그래서<br />
인지 왕을 향<strong>한</strong> 그의 權諫은 ≪說苑≫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진다.<br />
晉 平公<strong>이</strong> 봄에 누대를 축조하는 토목공사를 벌였다. <strong>이</strong>를 본 숙향<br />
<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서서 諫言하였다.<br />
「안 됩니다. 옛날 성왕들은 덕을 귀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데<br />
에 힘을 썼으며, 형벌을 완화시키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그들의<br />
때를 잘 살폈습니다. 지금은 봄인데 누대를 짓는다고 공사를 벌<strong>이</strong><br />
시니, <strong>이</strong>는 백성들의 때를 빼앗는 것입니다. 무릇 덕을 베풀지 않<br />
으면 백성<strong>이</strong> 따르지 않는 법<strong>이</strong>요, 형벌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백성<br />
들<strong>이</strong> 근심합니다. 또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을 억지로 부리고,<br />
근심과 원망에 쌓인 백성에게 노역을 시키고, 게다가 그들의 농사<br />
지을 때까지 빼앗으시니, <strong>이</strong>는 그들을 거듭 고갈되게 하는 것입니<br />
다. 무릇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양육<strong>한</strong>다는 뜻인데,<br />
도리어 그들을 고갈되게 만드니, <strong>이</strong> 어찌 명령과 존재를 안전히<br />
하여 후세에 임금<strong>이</strong>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br />
平公<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좋다」하고는 공사를 중지해 버렸다.<br />
( 晉平公春築臺, 叔向曰 : 「不可. 古者聖王貴德而務施, 緩形辟趨民<br />
時 : 今春築臺, 是奪民時也. 夫德不施, 則民不歸 ; 形不緩, 則百姓<br />
愁. 使不歸之民, 役愁怨之百姓, 而又奪其時, 是重竭也 ; 夫牧百姓,<br />
養育之而重竭之, 豈所以定命安存, 而稱爲人君於後世哉」平公曰:<br />
「善」乃罷築役.) 3)<br />
3) 林東錫 譯註, 1992, ≪說苑≫上․下 東文選 - 「 5卷 貴德 15章」P.184<br />
- 14 -
<strong>이</strong>를 통해 劉向은 儒家의 愛民思想에 근거하여 君道에 대해 말하<br />
고 더불어 諫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br />
劉向은 成帝 때에 다시 등용되었는데 <strong>이</strong>때 <strong>이</strong>름을 向으로 고쳤다.<br />
<strong>이</strong> 무렵 외척의 횡포를 견제하고 천자의 鑑戒가 되도록 하기 위해<br />
상고로부터 秦․漢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의 符瑞災異의 기록을 집성하여 주<br />
요저서인《洪範五行傳論》을 저술하였다. 그 밖의 편저로는 ≪說苑<br />
≫,≪新序≫ 4),《戰國策》 5)등, 그리고 궁중도서를 정리할 때 지은<br />
《別錄》 6)<strong>이</strong> 있다. 그의 아들 劉歆은 <strong>이</strong> 책을 <strong>이</strong>용하여 《七略》을<br />
저술하였으며《漢書》에는 그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다.<br />
劉向은 성제 때에 中郞으로 여러 차례 임금에게 상소하였으<strong>나</strong> 뜻<br />
4) 劉向<strong>이</strong> 편집<strong>한</strong> 고사집으로, 雜事, 刺事, 節士, 義勇, 善謀 등 총 10편으로<br />
구성되어 있다. 총 176개의 <strong>이</strong>야기가 들어있으며 각 편의 폭<strong>이</strong> 매우 크<br />
다. <strong>이</strong>야기 묘사와 의인화 수법<strong>이</strong> 뛰어<strong>나</strong>지만 창작<strong>이</strong> 아니라 <strong>이</strong>전 사람<br />
들의 저작을 가져와 썼다는 점과 <strong>이</strong>야기 대부분<strong>이</strong> 우언<strong>이</strong> 아니라는 점<br />
에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strong>이</strong>는 <strong>이</strong> 책을 정리<strong>한</strong> 목적<strong>이</strong> 우언 창작<br />
에 있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과거사를 거울삼아 후대에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br />
데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strong>이</strong>다. 세심<strong>한</strong> 구성 과정을 거쳐 가공됨<br />
으로써 서사가 간결하고 전개가 유창하여 문학적 가치가 크다.<br />
5) 劉向<strong>이</strong> 편찬<strong>한</strong> 책으로 西周, 東周, 秦, 齊, 楚, 趙, 魏, 韓, 燕, 宋, 衛, 中<br />
山의 12策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다. 주로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strong>한</strong> 策士와 謀士들<br />
의 문장을 모은 것으로 周<strong>나</strong>라 元王부터 秦<strong>나</strong>라 始皇까지 240년 간 살<br />
았던 여러 인사들의 주장<strong>이</strong> 실려 있다.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史記》<br />
에 기재된 내용과 겹지는 것<strong>이</strong> 많다.<br />
6) 劉向<strong>이</strong> 선별<strong>한</strong> 조정의 藏書目錄集으로 20권<strong>이</strong>다. 漢은 秦의 焚書坑儒로<br />
藏書가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널리 告示하여 서적을 獻上케 하고 또 각<br />
지방에 사자를 파견하여 남아 있는 서적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서책<br />
을 수집하였다. 劉向은 다른 것을 모으고 중복되는 것을 없앴으며 순서<br />
를 바로 하고 목차를 정했고 誤字 脫子를 교정하여 正本을 만들었다. 그<br />
리고 書名을 결정하는 동시에 書名篇目과 교정의 경위. 저자의 事蹟, 사<br />
상, 도서의 내용, 眞僞. 비평 등을 기록<strong>한</strong> 書錄을 만들어 첨부하였다. 그<br />
리고 별도로 각각의 書錄을 모아 《別錄》을 만들었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br />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그의 아들 흠<strong>이</strong> 아버지의 뜻을 <strong>이</strong>어 완성하였<br />
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 《別錄》은 당대에 없어져서 지금은 전하지 않고 다만 靑<br />
대의 馬國翰, 姚振宗 등<strong>이</strong> 逸文으로 모은 것으로 그 일부를 알 수 있을<br />
뿐<strong>이</strong>다.<br />
- 15 -
을 <strong>이</strong>루지 못하고 哀帝 원년에 72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br />
정치적으로 劉向의 말년은 왕권<strong>이</strong> 쇠퇴와 혼란을 거듭하였으며 그<br />
의 사후 13년 만에 결국 전<strong>한</strong> 왕조가 무너졌다.<br />
劉向은 또<strong>한</strong> 전<strong>한</strong> 때의 經學家<strong>이</strong>자 目錄學者로 널리 알려져 있다.<br />
<strong>이</strong>것은 그가 신분상 궁중의 도서를 마음껏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br />
능했던 일일 것<strong>이</strong>다.<br />
당시의 도서는 주로 竹簡<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木簡<strong>이</strong>었기 때문에 도서들<strong>이</strong> 훼손,<br />
탈간, 탈락되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br />
그리하여 劉向은 도서 정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작업에 <strong>나</strong>서게<br />
되었고 중국 目錄學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기에 <strong>이</strong>르렀다.<br />
劉向은 目錄學의 大家답게 자신<strong>이</strong> 읽고 수집했던 많은 고사에서<br />
얻은 것들을 토대로 천자에게 諷諫<strong>이</strong> 될만<strong>한</strong> 내용을 모아 편집하되<br />
우선 ‘새롭게 차례를 정해 選集<strong>한</strong> 책’<strong>이</strong>라는 뜻의《新序》와 교훈적<br />
인 <strong>이</strong>야기를 모은 ≪說苑≫등을 저술하였으며 104명의 여성을 유형<br />
별로 분류<strong>한</strong>《列女傳》을 탄생시켰다.<br />
그의 사상은 董仲舒와 관계가 있는데 <strong>이</strong>는 劉向<strong>이</strong> 董仲舒의 제자<br />
였기 때문<strong>이</strong>다. 劉向<strong>이</strong> 董仲舒의 영향을 많<strong>이</strong> 받았으리라는 것은 당<br />
연<strong>한</strong> 사실로 漢書 卷 56 에는 劉向<strong>이</strong> 董仲舒를 평가<strong>한</strong><br />
부분<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온다.<br />
劉向은 董仲舒야말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재능<strong>이</strong> 있다고 평하였<br />
다. 오히려 李伊, 呂望<strong>이</strong> 그보다 더 <strong>나</strong>을 것<strong>이</strong> 없다고 <strong>한</strong>다. 管仲,<br />
晏嬰등도 패자의 보좌였지만 董仲舒에는 미치지 못할 것<strong>이</strong>라고 하<br />
였다.<br />
(劉向稱董仲舒有王佐之材雖伊呂亡以加莞晏之屬伯者之佐一不及也.)<br />
7)<br />
7) 漢書 卷 56 〈董仲舒傳〉, p.1495<br />
- 16 -
劉向은 董仲舒로부터 전수 받은 유학을 중심으로 하고 陰陽家, 法<br />
家, 墨家思想 등을 겸하였다. 그래서 인지 그의 유학사상은 그리 엄<br />
격<strong>한</strong> 편은 아니다.<br />
또<strong>한</strong> 人君<strong>이</strong> 天意를 받들어 시행하면 천하가 평안해질 것<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天<br />
意를 거역하면 災異와 天戒가 있게 된다는 ‘天人感應說’ 또<strong>한</strong> 그의<br />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다.<br />
劉向<strong>이</strong> 정치적으로 활약하던 宣帝․ 元帝 ․成帝代에는 ‘五行災異<br />
說’<strong>이</strong> 크게 성행하였던 무렵으로 劉向 또<strong>한</strong> 天子를 경계시키고 외척<br />
의 세력을 억제하고 견제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五行災<br />
異說’<strong>이</strong> 함축된 상소문을 천자에게 올려 <strong>나</strong>라에 빈번하게 일어<strong>나</strong>는<br />
재난의 원인<strong>이</strong> 왕실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였다.<br />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strong>한</strong>대에 들어와 유가적 문학관<strong>이</strong> 사<br />
대부 계층 일반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strong>나</strong>아가 문학활동 전반<strong>이</strong> 왕실<br />
과 사대부계층 사<strong>이</strong>에서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다.<br />
武帝는 董仲舒의 건의에 “따라 儒學을 존중하여 모든 정책을 <strong>이</strong>에<br />
준하여 행하였다. 그러<strong>나</strong> 그의 만년에 <strong>이</strong>르러 사치와 미신에 빠져<br />
신설을 지극히 숭상하였던 것은 처음의 모습과는 매우 <strong>이</strong>율배반적<br />
인 지극히 사상적인 모순을 보여준 것<strong>이</strong>라 하겠다. 그러<strong>나</strong> 무제의<br />
입장에서 보면 그는 생각하고 <strong>이</strong>루고자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여 특<br />
히 만년에 허무주의적인 사고에 빠졌으며 神仙과 迷信, 黃老를 믿게<br />
된 것으로 보인다.<br />
그로 인해 유학의 위치가 불안해지며 학자들의 사상 또<strong>한</strong> 혼미해<br />
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strong>이</strong>다.<br />
게다가 무제가 죽고 宣帝의 在位 <strong>이</strong>후에는 정치의 부패와 환관 세<br />
력의 대두, 외척의 등장으로 漢을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결과<br />
를 빚고 만다.<br />
- 17 -
따라서 무너진 유학의 政論을 바로잡고자 劉向은 先王들의 모범적<br />
인 사례 또는 귀감<strong>이</strong> 되는 여러 역사 故事들을 통해 교훈을 전하고<br />
자 <strong>한</strong>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儒家의 정<br />
치사상과 윤리관념을 천명하기에 <strong>이</strong>른 것<strong>이</strong>다. 그의 다른 저서 《新<br />
序》가 <strong>이</strong>와 성질<strong>이</strong> 비슷하다 할 것<strong>이</strong>다.<br />
하지만 내용<strong>이</strong> 주로 위정자들에 관<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지만 뿐만 아니라 학자<br />
들과 일반 백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strong>이</strong>루어<br />
진 것<strong>이</strong>《新序》와 다른 점<strong>이</strong>라 하겠다.<br />
劉向의 또 다른 대표작은《列女傳》으로,《列女傳》을 저술할 당<br />
시 西漢末에는 趙飛燕<strong>이</strong>라는 後宮<strong>이</strong> 皇后를 쫓아내고 皇子를 살해<br />
<strong>한</strong> 趙氏內亂<strong>이</strong> 있었다. <strong>이</strong>는 劉向<strong>이</strong>《列女傳》을 서술하게 된 직접<br />
적인 동기가 되었다.<br />
劉向은 《列女傳》을 통해 다양<strong>한</strong> 여성상을 제시하려 했다. 하지만<br />
<strong>이</strong> 보다 중요<strong>한</strong> 동기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외척을 제거하고 趙<br />
氏 政權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을 것<strong>이</strong>라 보고 있다. 劉向은 곧은<br />
성품으로 황제에게 여러 번 상소를 올렸으<strong>나</strong> 황제의 노여움을 사<br />
감옥에 간 일도 있었다. <strong>이</strong> 같은 성품을 지닌 劉向<strong>이</strong> 황실의 자손으<br />
로 혼란에 빠진 황실의 상황을 황제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던 것은<br />
당연<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br />
劉向은 神話時代부터 後漢에 <strong>이</strong>르는 기간에 걸쳐 자신<strong>이</strong> 설정<strong>한</strong> 7<br />
개의 유형을 대표할 여성 110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술하<br />
고 논평하였다. 그 대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母儀傳〉에서<br />
는 남편을 잘 보필했거<strong>나</strong> 아들 교육을 잘 시킨 여성들, 두번째〈賢<br />
明傳〉에서는 사리에 밝고 시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여성들. 세번<br />
째〈仁智傳〉에서는 식견과 재능<strong>이</strong> 있는 여성들. 네번째〈貞順傳〉<br />
에서는 예교를 철저히 지킨 여성들, 다섯번째〈節義傳〉에서는 절개<br />
- 18 -
와 외리를 실천<strong>한</strong> 여성들, 여섯 번째〈辯通傳〉에서는 언어능력<strong>이</strong><br />
뛰어<strong>나</strong>고 유연하게 사건에 대처할 줄 아는 여성들. 일곱번째〈孼嬖<br />
傳〉에서는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strong>한</strong> 행동을 <strong>한</strong> 여성들. <strong>이</strong>같<strong>이</strong> 일곱<br />
부류의 여성들의 행적을 실었다.<br />
《列女傳》에서 〈孼嬖傳〉을 제외하고는 不德의 모습으로 천편일<br />
률적인 묘사에서 벗어난, 소질과 능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사회의<br />
義를 추구<strong>한</strong> 여성들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strong>이</strong>는 비록 유학<strong>이</strong><br />
국교로 정해지긴 했지만 아직은 고대의 자유로운 풍속<strong>이</strong> 남아있던<br />
<strong>한</strong>대의 사회 정황을 반영하는 것<strong>이</strong>기도 하고 유향 자신의 비교적<br />
너그러운 사상적 경향을 드러내 보<strong>이</strong>는 것<strong>이</strong>기도 하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러<br />
<strong>한</strong> 사실<strong>이</strong> 궁극적으로 《列女傳》<strong>이</strong> 여성 자신보다 남성, 즉 그들<strong>이</strong><br />
구축<strong>한</strong> 가부장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저술되었다는 본래의<br />
넘어서지는 못<strong>한</strong>다고 평가되고 있다.<br />
어진 아내 혹은 훌륭<strong>한</strong> 어머니로서의 모범적인 여성상을 제시<strong>한</strong><br />
〈母儀傳〉으로부터 시작해서 <strong>나</strong>라와 집안을 망친 사악<strong>한</strong> 여성들을<br />
열거<strong>한</strong> 〈孼嬖傳〉으로 끝<strong>나</strong>는 《列女傳》의 전체구성은 결국 여성<br />
의 능력과 역할<strong>이</strong>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strong>나</strong>야 하는지, 그<br />
<strong>한</strong>계와 귀착점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그러<strong>나</strong>《列女傳》은 고대 여성들의 다양<strong>한</strong> 삶을 보여주고 있는 좋<br />
은 자료라 하겠다.<br />
- 19 -
第Ⅲ章. ≪說苑≫의 內容 分析<br />
第1節. ≪說苑≫속의 人物 形象<br />
본 절에서는 ≪說苑≫의 고사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그 형상에<br />
따라 분류해 보려<strong>한</strong>다. 유교의 정치 <strong>이</strong>념과 그 사상을 밝히는 책에<br />
서 가장 많<strong>이</strong> 등장하는 사람은 군신관계의 예가 되는 신하와 왕<strong>이</strong><br />
다. 그 두 부류와 또 유교사상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군자의<br />
모습을 각기 예로 들고 살펴 보려<strong>한</strong>다.<br />
≪說苑≫에서 지양하고 있는 각 인물들의 모습을 어떤지 살펴보고<br />
그와 잘 부합되는 고사들을 예로 들어보려 <strong>한</strong>다.<br />
(1). ≪說苑≫속의 君主 形象<br />
≪說苑≫은 劉向의 저서《新序》와 마찬가지로 유가의 정치 사상<br />
과 윤리 관념을 천명하기 위해 지은 것<strong>이</strong>다. 총 20卷 846章으로 <strong>이</strong><br />
루어졌으며 각 권마다 수많은 故事를 두어 윤리 <strong>이</strong>념을 피력하고<br />
있다.<br />
유가의 정치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strong>한</strong> 글<strong>이</strong>기에 당연히 가장 많<strong>이</strong><br />
등장하는 인물은 왕과 신하<strong>이</strong>다.<br />
그 정치 <strong>이</strong>념과 윤리를 특별히 ‘<strong>이</strong>것은 바로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렇게 설<br />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권마다의 故事를 읽다 보면 자연 유<br />
가의 사상을 알게 되며 거부감 없<strong>이</strong> 받아들일 수 있다.<br />
先秦時代부터 漢代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선왕들의 고사를 싣고 있어 후대<br />
의 임금에게 본<strong>이</strong> 되기를 바라는 마음<strong>이</strong> 느껴진다.<br />
- 20 -
그 기간 동안의 임금들<strong>이</strong> 하<strong>나</strong>같<strong>이</strong> 성군의 형상을 하고 있지는 않<br />
다. 하지만 ≪說苑≫에서는 대부분<strong>이</strong> 하늘에서 내린 성품과 지혜를<br />
겸비<strong>한</strong> 성군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폭군<strong>이</strong>었던 임<br />
금의 고사는 소개되고 있지 않고 약간 성품<strong>이</strong> 부족하다 <strong>한</strong>다면 훌<br />
륭<strong>한</strong> 신하를 곁에 둔 임금으로 소개되고 있다. <strong>이</strong>는 後王들에게 모<br />
범과 본<strong>이</strong> 되는 모습<strong>이</strong>기에 고사를 선정하며 <strong>이</strong>를 가려 넣었으리라<br />
생각된다.<br />
1). 聖君形象<br />
훌륭<strong>한</strong> 임금은 덕과 교화를 베푼 후에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지켜지지 않을 때<br />
에 부득히 형벌을 가하는 왕<strong>이</strong>다. 임금의 성품 중 가장 중요<strong>한</strong> 것은<br />
백성을 자식과 같<strong>이</strong> 생각하는 마음<strong>이</strong>다.<br />
6卷 復恩 26章에서는 魏<strong>나</strong>라 장수 吳起의 고사가 소개된다. 오기가<br />
종기를 앓는 병사의 고름을 빨아주었다. 그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br />
미가 통곡하였다. 그 아버지도 전에 같은 일을 겪고 전쟁터에서 전<br />
사하였기 때문<strong>이</strong>다. 위 장수 오기가 일부러 어린 병사에게 덕을 행<br />
해 자기의 충복<strong>이</strong> 되게 하려 함<strong>이</strong> 아니다. 게다가 병사의 아버지를<br />
기억하고 있지도 못할 것<strong>이</strong>다. 종기 앓는 병사의 고름을 빨아줄 정<br />
도로 아랫사람을 아끼는 마음, 작은 것에도 덕을 베풀 줄 아는 마음<br />
<strong>이</strong>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strong>한</strong> 덕목<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br />
≪說苑≫에서 좋은 짝을 <strong>이</strong>루며 등장하는 왕과 신하를 齊 景公과<br />
晏子라 하겠다. 두 사람<strong>이</strong> 등장하는 대부분의 고사가 晏子의 현명함<br />
과 강직<strong>한</strong> 성품, 또 진실<strong>한</strong> 諫言<strong>이</strong> 중심<strong>이</strong>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br />
여러 편의 고사를 읽다보면 晏子만 좋은 신하로 돋보<strong>이</strong>는 것<strong>이</strong> 아<br />
니다. 그 간언을 듣고 실행하는 景公 역시 훌륭<strong>한</strong> 임금임을 알 수<br />
있다. 임금<strong>이</strong> 엄하면 아랫사람은 입을 다물고 만다. 임금으로서 좋<br />
- 21 -
은 성품을 지녔기 때문에 안자처럼 재주 있는 자를 곁에 둘 수 있<br />
었을 것<strong>이</strong>다. 그리고 안자의 간언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br />
모습을 통해 임금<strong>이</strong> 갖추어야할 성품과 임금으로의 자세를 볼 수<br />
있게 된다.<br />
≪說苑≫에서 劉向<strong>이</strong> 택<strong>한</strong> 임금의 고사들을 읽다보면 약간 당황스<br />
럽기도 하다. 임금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들<strong>이</strong> 매우 까다롭기 때문<strong>이</strong><br />
다. 왕으로서 백성을 향<strong>한</strong> 긍휼<strong>한</strong> 마음, 즉 부모의 마음<strong>이</strong> 있어야<br />
<strong>한</strong>다. 옛날 禹임금은 죄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백성의 죄지음은<br />
오직 <strong>나</strong> <strong>한</strong>사람 때문’<strong>이</strong>라고 말하였다 8) <strong>한</strong>다.<br />
儒敎의 기본 정신인 愛․忠․仁․孝 가운데 임금에게 해당하는 덕<br />
목은 仁과 愛<strong>이</strong>며 劉向<strong>이</strong> 더욱 강조하고 있는 왕으로의 성품은 愛<br />
인 것<strong>이</strong>다. 仁<strong>이</strong> 부족<strong>한</strong> 임금<strong>이</strong>라 하여도 좋은 신하를 만<strong>나</strong>면 <strong>이</strong>는<br />
채워지는 부분<strong>이</strong>지만 愛는 타고<strong>나</strong>는 성품<strong>이</strong>기에 신하들의 보필에도<br />
채워짐<strong>이</strong> 쉽지 않다. 훌륭<strong>한</strong> 임금은 덕과 은혜를 널리 베풀고도 백<br />
성에게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strong>이</strong>렇게 임금으로 신하의 쓴소리를<br />
달게 듣고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strong>한</strong>다. 그리고 국가의 권력<strong>이</strong>란<br />
임금에게 속해 있어야 <strong>한</strong>다는 것<strong>이</strong> 유향의 주장<strong>이</strong>다. 백성을 자식처<br />
럼 대하지만 백성<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라의 근본<strong>이</strong> 되는 것<strong>이</strong>지 <strong>나</strong>라의 주인<strong>이</strong> 되<br />
는것은 아니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어진 임금<strong>이</strong> 근심하는 가운데 있고 묘책은 현명<strong>한</strong> 신하들<strong>이</strong> 세운<br />
다. 다시 말해 宮 안에서만 근심하고 宮 밖의 백성은 부지런히 자신<br />
의 소임을 다하면 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유향<strong>이</strong> 그리고 있는 <strong>이</strong>상적<br />
인 治道의 모습<strong>이</strong>다.<br />
劉向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임금의 일<strong>이</strong>며 일을 아는 것은 신하<br />
의 일<strong>이</strong>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또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근본<strong>이</strong>고 어느 <strong>한</strong> 곳<br />
에서도 어긋<strong>나</strong>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仁厚로 백성을 대하는<br />
8) 林東錫 譯註, 1992, ≪說苑≫上․下 東文選 - 「 1卷 君道 9章」P.11<br />
- 22 -
왕도정치를 말하고 있다. 근본<strong>이</strong> 바로 서면 모든 것<strong>이</strong> 제자리를 찾<br />
는다. ≪說苑≫에서 임금<strong>이</strong>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일목요연하게<br />
정리해 놓은 고사가 있어 그를 예로 든다.<br />
英明<strong>한</strong> 군주는 세 가지 두려워하는 바가 있다.<br />
첫째는 높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서 자기의 과실을 듣지 못할까 두<br />
려워함<strong>이</strong>요, 둘째는 득의만만하여 교만해지지<strong>나</strong> 않을까 하는 두려<br />
움<strong>이</strong>요, 셋째는 천하의 훌륭<strong>한</strong> 말을 듣고도 <strong>이</strong>를 실행에 옮기지<br />
못할까 하는 두려움<strong>이</strong>다.<br />
그러면 어떻게 해서 <strong>이</strong>것을 알 수 있는가? 옛날 鉞王 勾踐<strong>이</strong> 吳<br />
<strong>나</strong>라와 싸워 그들을 크게 쳐부수고, 아울러 九夷까지 정복하게 되<br />
었다. <strong>이</strong> 때에 그는 南面하여 왕<strong>이</strong> 되어 가까<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신하가 셋, 멀리<br />
서 온 신하가 다섯<strong>이</strong>었다. 그러면서 여러 신하들에게 「<strong>나</strong>의 과실<br />
을 듣고도 <strong>나</strong>에게 고하지 않은 자는 형벌의 죄에 처하리라」고 하<br />
였다.<br />
<strong>이</strong>는 바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그 과실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br />
<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다. 다음으로 晉 文公<strong>이</strong> 楚와 싸워 크게 <strong>이</strong>긴 다음 그 군<br />
대를 불질러 사흘 동안 꺼지지를 않았다. 문공<strong>이</strong> 물러<strong>나</strong>서 근심스<br />
러운 얼굴을 하자, 곁에 모시고 있던 자가 「지금 초<strong>나</strong>라를 크게<br />
<strong>이</strong>겼는데 도리어 근심스러운 얼굴<strong>이</strong>시니 무슨 까닭입니까?」라고<br />
물었다.<br />
<strong>이</strong>에 문공은 「내가 듣기로 싸움에 <strong>이</strong>기고 <strong>나</strong>서 편안할 자는 곧<br />
성인밖에 없다고 했다. 무릇 남을 속<strong>이</strong>는 승리는 위험하지 않은<br />
경우가 없다. 내 <strong>이</strong> 까닭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strong>이</strong>다」라고 하<br />
였다. <strong>이</strong>는 바로 득의하여 교만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또 옛날 薺 桓公<strong>이</strong> 管仲과 濕朋을 얻었을 때, 그들은 그 언사가<br />
분명하였고 그 뜻<strong>이</strong> 훌륭하였다.<br />
正月의 朝會에 太牢를 바쳐 선조의 사당에 제사를 올리면서 환공<br />
은 西面하여 서고, 관중과 습붕은 東面하여 마주 섰다. 환공<strong>이</strong> 贊<br />
- 23 -
하여 <strong>이</strong>르되 「내가 두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눈<br />
<strong>이</strong> 밝아졌고 귀가 총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 독단적으로 일<br />
을 하지 않게 되었으니, 원컨대 두 사람을 조상께 추천해 올리<strong>나</strong><br />
<strong>이</strong>다」고 하였다.<br />
<strong>이</strong>는 바로 천하의 지당<strong>한</strong>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어쩌<br />
<strong>나</strong> 하고 두려워하는 예<strong>이</strong>다.<br />
( 明主者有三懼, 一曰處尊位, 而恐不聞其過, 二曰得意, 而恐驕, 三<br />
曰聞天下之至言,而恐不能行, 何以識其然也? 越王勾踐與吳人戰, 大<br />
敗之, 兼有九夷, 賞是時也, 南面而立, 近臣三, 遠臣五,令羣臣曰:「聞<br />
吾過而不告者其罪刑.」 此處尊位, 而恐不聞其過者也. 昔者, 晉文公<br />
與楚人戰, 大勝之, 橈其軍, 火三曰不滅, 文公退而有憂色, 侍者曰:<br />
「君大勝楚, 今有憂色, 何也?」 文公曰: 「吾聞能以戰勝而安者, 其<br />
唯聖人乎! 若夫詐勝之徒, 未嘗不危也, 吾是以憂.」 此得意而恐驕也.<br />
昔齊桓公得管仲濕朋, 辯其言, 設其正月之朝, 令具太牢進之先祖, 桓<br />
公西面而立, 管仲濕朋東面而立, 桓公贊曰: 「自吾得廳二子之言, 吾<br />
目加明, 耳加聽, 不敢獨壇, 願薦之先祖.」 此聞天下之至言, 而恐不<br />
能行者也.) 9)<br />
<strong>이</strong> 예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strong>이</strong> 임금<strong>이</strong>라면 높은 자리에 있<br />
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또 항상 자신의 과실을 들을 수 있도록<br />
겸손<strong>한</strong> 마음을 갖고 있어야 <strong>한</strong>다.<br />
현명하고 훌륭<strong>한</strong> 성품을 가진 임금<strong>이</strong>라면 자연히 주변에 좋은 신<br />
하들<strong>이</strong> 모<strong>이</strong>게 될 것<strong>이</strong>다. 그리고 그들의 간언을 듣고 실행할 수 있<br />
는 임금<strong>이</strong>라면 정말 훌륭<strong>한</strong> 임금<strong>이</strong>다. 아예 듣지도 않는 임금<strong>이</strong> 있<br />
고 듣기는 듣지만 실행하지 않는 임금도 있다. 景公은 晏子의 諫言<br />
을 듣고 실행하니 정말 훌륭<strong>한</strong> 임금<strong>이</strong>라 할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것은 ≪說苑≫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왕의 모습<strong>이</strong>며 올바른<br />
9) 上揭書 -「 1卷 君道 22章」P.30<br />
- 24 -
정치의 모습<strong>이</strong>기도 하다.<br />
어떤 <strong>이</strong>가 조간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과실을 고치지 않습니<br />
까?」<strong>이</strong>에 간자는「좋다!」라고 했다. <strong>이</strong>를 들은 좌우가 의아해서<br />
물었다. 「군께서는 과실도 없는데 무엇을 고친다는 말입니까?」<br />
그러자 간자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좋다라고 <strong>한</strong> 것은 꼭<br />
과실<strong>이</strong>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장차 <strong>나</strong>의 잘못<strong>이</strong> 있으면 <strong>이</strong>를 간<br />
할 자를 구할 것<strong>이</strong>면서, 지금 <strong>이</strong>를 거부하면 <strong>이</strong>는 곧 간언하는 자<br />
를 물리치겠다는 뜻<strong>이</strong> 되어, 간언하려던 자들<strong>이</strong> 걸음을 멈추고 내<br />
게로 오려 하지 않을 것<strong>이</strong>고, <strong>나</strong>는 머지않아 잘못에 바져들게 될<br />
것<strong>이</strong>다.」(或謂趙簡子曰 : 「君何不更乎?」簡子曰 : 「諾」左右曰 :<br />
「君未有過, 何更?」君曰: 「君謂是諾, 未必有過也, 吾將求以來諫者<br />
也, 今我却之, 是却諫者, 諫者必止, 我過無日矣.」<br />
<strong>이</strong> 예문에서 잘 표현하고 있듯<strong>이</strong> 훌륭<strong>한</strong> 임금<strong>이</strong>란 아랫사람의 어<br />
떠<strong>한</strong> 충고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strong>한</strong> 마음을 가진 임금<strong>이</strong>다.<br />
선하지 못<strong>한</strong> 임금은 충직<strong>한</strong> 신하의 간언을 듣지 않는다. 몸에 좋은<br />
약은 입에 쓰고 忠言은 귀에 거슬린다는 옛날처럼 신하의 직언<strong>이</strong><br />
거슬려 듣지 않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아첨꾼들은 곁에 두는 왕<strong>이</strong><br />
라면 선<strong>한</strong> 왕<strong>이</strong> 아니다. 간언을 듣지 않는다면 현명<strong>한</strong> 선비들<strong>이</strong> 곁<br />
에 있을 수 없다. 선비가 참여하지 않는 정치는 좋은 모양<strong>이</strong> 될 수<br />
없다. 또<strong>한</strong> 주변에 좋은 신하가 있다 하더라도 공에 맞게 賞 주는<br />
것을 모르는 임금<strong>이</strong>라면 역시 주변에 좋은 신하가 있을 수 없다. 그<br />
리고 백성에 대해 아비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임금을 좋은 임금<strong>이</strong><br />
라 말할 수 없다. 宮안의 창고만 가득 채워지는 <strong>나</strong>라는 좋은 정치를<br />
하고 있는 <strong>나</strong>라가 아니다. 임금<strong>이</strong> 사치와 노는 것을 즐겨 씨를 뿌리<br />
고 곡식을 거둬야 할 시기에 궁궐의 담을 높<strong>이</strong> 쌓고 궁궐을 아름답<br />
- 25 -
게 꾸미기만 백성들의 생활은 말 할 수 없<strong>이</strong> 어려워 질 것<strong>이</strong>다. 악<br />
<strong>한</strong> 임금은 仁과 愛의 성품<strong>이</strong> 부족<strong>한</strong> 사람<strong>이</strong>며 그것 보다 더 큰 문<br />
제는 가까<strong>이</strong>에 선<strong>한</strong> 선비를 두지 않는 사람<strong>이</strong>다.<br />
어떤 <strong>이</strong>가 말하였다.「桓公<strong>이</strong> 仁義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br />
兄을 죽<strong>이</strong>고 왕위에 올랐으니 인의롭다고 볼 수 없다. 또 환공을<br />
恭儉하다고 볼 수 있겠는가? 부인들과 같<strong>이</strong> 수레를 타고 거리를<br />
쏘다녔으니 역시 공검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면 환공을 淸潔하다<br />
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strong>나</strong> 閨門 안에 식을 올리지 않고 맞<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br />
여자들뿐<strong>이</strong>니 청결하다고 볼 수 없다. <strong>이</strong> 세 가지는 바로 亡國失<br />
君<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할 행동<strong>이</strong>다. 그런데도 환공은 천하를 얻었다. <strong>이</strong>는 管仲과<br />
隰朋을 등용하여, 九合諸侯하고 一匡天下하여 모두 <strong>이</strong>끌고 周室을<br />
조알하며 오패 중에 우두머리가 된 것. <strong>이</strong> 모두 그 어진 보좌를<br />
얻었기 때문<strong>이</strong>다. 그러<strong>나</strong> 관중과 습붕을 잃은 다음. 豎刁와 易牙를<br />
임명하여 자신<strong>이</strong> 죽은 다음에는 장례도 치리지 못했고, 그 시신에<br />
서 <strong>나</strong>온 구더기가 문지방으로 기어 <strong>나</strong>올 정도였으니. <strong>한</strong> 사람의<br />
영화와 모욕<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렇듯 함께 <strong>한</strong>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바로 누구를<br />
썼느냐에 따란 달라진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로 말미암에 보건대, 보좌의 임명<br />
<strong>이</strong>란 얼마<strong>나</strong> 절박<strong>한</strong> 일인가?」<br />
或曰: 「將謂桓公仁義乎? 殺兄而立, 非仁義也; 將謂桓公恭儉乎? 與<br />
婦人同輿, 於邑中, 非恭儉也; 將謂桓公淸潔乎? 閨門之內, 無可嫁<br />
者, 非淸潔也. 此三者. 亡國失君之行也, 然而桓公兼有之, 以得管<br />
仲․隰朋, 九合諸侯, 一匡天下, 朝周室, 爲五霸長, 以其得賢佐也; 失<br />
管仲․隰朋, 任豎刁, 易牙, 身死不葬, 蟲流出戶. 一人之身, 榮辱俱施<br />
者, 何者? 其所任異也. 由此觀之, 則任佐急矣.」 10)<br />
제 환공은 결코 폭군<strong>이</strong> 아니다. <strong>이</strong> 고사는 신하의 등용으로 인해<br />
10) 上揭書 -「 8卷 尊賢 7章」P.320<br />
- 26 -
왕의 정치와 삶의 모습<strong>이</strong> 어떻게 바뀌는 가를 더욱 강조<strong>한</strong> 고사<strong>이</strong><br />
다. 管仲과 隰朋<strong>이</strong> 죽은 후 桓公<strong>이</strong> 가까<strong>이</strong> 했던 豎刁는 스스로 거세<br />
하여 임금을 가까<strong>이</strong> 하였던 신하<strong>이</strong>며 易牙는 환공의 요리담당 신하<br />
로 환공<strong>이</strong> 사람고기를 먹어보지 못하였다고 하자 자신의 아들을 삶<br />
아 바쳤다고 <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들은 임금의 당시의 기분을 맞춰주고 잠시만<br />
기쁘게 해준 아첨하는 신하들<strong>이</strong>다. 그리고 <strong>이</strong>들<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행동은 모두<br />
仁<strong>이</strong> 아닌 것<strong>이</strong>다. 임금에게 자신의 아들을 삶아 바친 것<strong>이</strong> 어찌 충<br />
성<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겠는가? <strong>이</strong>런 거짓된 충성으론 임금을 바로 세울<br />
수 없다. 훌륭<strong>한</strong> 선비를 알아보고 곁에 두는 것도 왕으로써 갖추어<br />
야할 조건<strong>이</strong> 아닐 수 없다. 몸에 좋은 약<strong>이</strong> 입에 쓴 법인데 기분<strong>이</strong><br />
상하였다고 해서 자기 행실에 대해 전혀 반성도 않고 오히려 諫言<br />
<strong>한</strong> 신하를 죽여 버렸다.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왕은 훌륭<strong>한</strong> 왕<strong>이</strong>라 할 수 없다.<br />
훌륭<strong>한</strong> 임금<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렸을 때는 <strong>나</strong>라 안에서 고민<strong>이</strong>란 宮室<br />
안에서만 행해지고 천하의 다스려지는 모습을 <strong>한</strong>눈에 알 수 있었다.<br />
임금 자신의 행실에 반성을 통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근본<strong>이</strong>다.<br />
≪說苑≫의 고사 가운데에는 董仲舒의 天人感應論에 입각<strong>한</strong> 고사<br />
들<strong>이</strong> 매우 많<strong>이</strong> 등장<strong>한</strong>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하늘은 스스로<br />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속담<strong>이</strong> 있다. 왕으로서 <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라를 잘 다스<br />
릴 때 하늘도 祥瑞와 災異로 應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初<strong>나</strong>라 莊王<strong>이</strong> 하늘에는 더 <strong>이</strong>상 요괴의 징조가 보<strong>이</strong>지 않고 땅에<br />
서도 더 <strong>이</strong>상 妖孼의 흉조가 보<strong>이</strong>지 않자, <strong>이</strong>에 산천에 제사를 지<br />
내며 <strong>이</strong>렇게 기도하였다. <strong>이</strong> 뜻은 하늘<strong>이</strong> 자신의 과실을 능히 찾<br />
아내어 주기를 간구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에 그는 諫言하는 말을 거역하<br />
지 않으며 편안할 때에 위험을 잊지 않겠다는 맹세하였다. <strong>이</strong> 까<br />
닭으로 그는 마침내 패업을 성취시킬 수 있었던 것<strong>이</strong>다. (楚莊王<br />
- 27 -
見天不見妖而地不出孼, 則禱於山川曰 : 「天其忘予흠歟?」此能求過<br />
於天, 必不逆諫矣, 安不忘危, 故能終而成霸功焉. 11)<br />
<strong>이</strong> 예문에서 보<strong>이</strong>듯 楚 莊王은 신하들의 간언을 듣고, 또 하늘에<br />
비춰 자신의 과실을 찾으며 조심하고 있다. 조심하여 자신을 추스려<br />
그는 결국 春秋五霸 가운데 하<strong>나</strong>가 되었다. 그러<strong>나</strong> 장왕의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성품으로 인해 춘추오패가 되었겠지만 하늘에서 정하여 내린 天子<br />
라 말해도 부족함<strong>이</strong> 없을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렇게 ≪說苑≫에서는 군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說苑≫의 왕<br />
<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오는 600편 정도의 고사 중 暴君<strong>이</strong> 등장하는 고사는 10%에도<br />
미치지 못<strong>한</strong>다. 따라서 聖王의 형상만을 다루었다. 先秦時代부터 漢<br />
<strong>나</strong>라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폭군<strong>이</strong> 매우 많았겠지만 폭군의 모습보다는 성<br />
군의 모습을 ≪說苑≫에는 담고 있다. <strong>이</strong>것은 <strong>이</strong>를 통해 劉向 본인<br />
<strong>이</strong> 선왕들의 좋은 모습, 본받을 만<strong>한</strong> 행동<strong>이</strong> 담긴 고사만을 가려 뽑<br />
아 담았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br />
(2). ≪說苑≫속의 臣下 形象<br />
일을 아는 사람을 신하라 하였다. 사람을 알아보고 어진 사람을<br />
꼭 맞는 자리에 세웠다면 임금으로서의 임무를 70%정도는 <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br />
다. 신하의 일은 임금을 도와 바른 정치를 하는 것<strong>이</strong>다. 신하가 아<br />
무리 뛰어난 자라하여도 임금보다 더 크게 <strong>이</strong>름<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서는 안 된다.<br />
임금의 仁을 널리 내세우는 신하가 최고의 신하<strong>이</strong>고 임금의 <strong>나</strong>쁜<br />
소문<strong>이</strong> 멀리 <strong>나</strong>가게 하는 신하는 <strong>나</strong>라를 망하게 할 신하<strong>이</strong>다. 임금<br />
11) 上揭書 -「 1卷 君道 32章」P.41<br />
- 28 -
의 인을 가려서는 안 된다.<br />
임금을 보필하여 임금의 인을 세상에 널리 알리되 자신의 인<strong>이</strong> 임<br />
금을 것을 넘거<strong>나</strong> 덮어서는 안 된다니 매우 어려운 말<strong>이</strong>라 생각된<br />
다.<br />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아랫사람의 도리인 것<strong>이</strong>다. 아랫사람의 도리는 땅과<br />
같다. 세상의 모든 곡식과 식물을 키워내지만 땅은 잘난 체 하지 않<br />
고 마음에 들지 않는 씨앗<strong>이</strong>라 해서 썩혀 내버리지 않는다. 좋은 땅<br />
에서 실<strong>한</strong> 열매를 낸다고 사람들의 눈은 열매에 집중되어 열매만<br />
기특하다 칭찬<strong>한</strong>다. 그렇다고 그 다음해 땅<strong>이</strong> 서운하다 여겨 소산을<br />
내지 않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듯 신하는 남을, 다시 말해 왕을 키우는 자<strong>이</strong><br />
다.<br />
또<strong>한</strong>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않고 자신의 뜻을 세울 줄 알아야 <strong>한</strong><br />
다. 목숨을 건 諫言,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說苑≫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다. 진실<br />
된 忠에서 비롯된 것<strong>이</strong> 바로 간언<strong>이</strong>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說苑≫에 신하의 도리에 대해 정리되어있는 고사가 있어 예를<br />
들어본다.<br />
남의 신하된 자로서의 처세술은 순종하면서 復命하되 감히 전횡<br />
을 부리지 않으며, 義를 구차스럽게 합리화하키지 않으며, 지위를<br />
구차스럽게 높<strong>이</strong>지 않아야 <strong>한</strong>다. 그렇게 하면 <strong>나</strong>라에 반드시 <strong>이</strong>익<br />
<strong>이</strong> 있고, 임금에게 보필함<strong>이</strong> 있게 된다. 따라서 그 자신은 존귀해<br />
지고 자손들도 <strong>이</strong>를 보존하게 된다. <strong>이</strong>에 남의 신하된 자로서의<br />
행동에는 六正과 六邪가 있으니, 六正을 바르게 실천하며 영화를<br />
볼 것<strong>이</strong>요, 六邪를 범하면 욕을 입게 된다. 무릇 榮辱<strong>이</strong>란 바로 禍<br />
福의 문<strong>이</strong>다. 그러면 육정과 육사란 무엇인가? 육정<strong>이</strong>란 다음 여<br />
섯가지<strong>이</strong>다. 첫재, 어떤 일의 싹<strong>이</strong> 태동하기 전에 또 형태<strong>나</strong> 조짐<br />
<strong>이</strong> 아직 보<strong>이</strong>기도 전에 환하게 그 存亡의 기와 득실의 요체를 남<br />
- 29 -
보다 미리 알고, 그러<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타<strong>나</strong>기 전에 <strong>이</strong>를 미리 막아 임금<br />
으로 하여금 초연히 顯榮<strong>한</strong> 위치에 서게 하여, 천하가 모두 盡忠<br />
하다고 칭함을 듣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聖臣<strong>이</strong>다. 둘째,<br />
마음을 비우고 그 뜻을 깨끗<strong>이</strong> 하여 선으로 <strong>나</strong>가 도에 통하며, 임<br />
금을 예의로 면려하여 옮은 몸가짐을 갖도록 하고, 임금을 깨우쳐<br />
장구<strong>한</strong> 계책을 세우도록 하며, 그 미덕은 순종토록 하고 그 악은<br />
고쳐 구제해 주어 공을 세우고 일을 성취시키되 그 공을 모두 임<br />
금에게 미루며, 감히 자신의 노고를 자랑하지 않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br />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良臣<strong>이</strong>다. 셋째, 몸을 낮추고 겸손히 하여 아침 일<br />
찍 일어<strong>나</strong> 밤 늦게 잠자리에 들며, 어진 <strong>이</strong>를 추천하기를 게으르<br />
지 않으며, 자주 옛일의 덕행 고사를 임금에게 들려주어 그를 면<br />
려시켜 <strong>이</strong>익<strong>이</strong> 있도록 <strong>이</strong>끌어 주어 국가의 사직과 종묘를 편안히<br />
해주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忠臣<strong>이</strong>다. 넷째, 드러<strong>나</strong>지 않<br />
은 부분을 밝게 살펴 성패를 보기를 남보다 빨리 하여 <strong>이</strong>를 미리<br />
막아 구해 내고 끌어내어 복구시킨다. 또 그 <strong>이</strong>간을 막고 그 화의<br />
근원은 근절시키며 화를 돌려 복<strong>이</strong> 되도록 하여, 임금으로 하여금<br />
끝내 근심<strong>이</strong> 없도록 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智臣<strong>이</strong>다.<br />
다섯째, 법을 잘 지켜 받들어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되 녹<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br />
상을 사양하며, 선물, 增送,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의복은 단정히,<br />
음식은 절약, 검소하게 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貞臣<strong>이</strong><br />
다. 여섯째, 국가가 혼란하고 임금의 정치가 도에 어긋날 때 감히<br />
임금의 얼굴을 붉히도록 범하며, 임금의 과실을 지적하되 죽음도<br />
불사하며, 그 몸<strong>이</strong> 죽더라도 국가만 편안하면 된다고 여겨 자기가<br />
<strong>한</strong>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直臣<strong>이</strong><br />
다.<br />
다음으로 六邪는 아래의 여섯 가지<strong>이</strong>다. 첫째, 관직에는 안일하며<br />
녹을 탐하고, 사사로운 자기 집안 일은 열심히 하되 공사에는 힘<br />
을 쏟지 않고, 자신의 지혜<strong>나</strong> 능력을 공익에는 쓰리 않으려 하며,<br />
임금에게 바칠 논책은 궁색, 기갈하며, 그 절조를 다하지 않고 오<br />
- 30 -
히려 세상의 부침에 놀아<strong>나</strong>되 임금 좌우를 관망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br />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具臣<strong>이</strong>다. 둘째, 임금<strong>이</strong>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하<br />
고 임금<strong>이</strong> 하는 일은 무조건 가하다 하며, 숨어서 임금<strong>이</strong> 좋아하<br />
는 것을 구해 <strong>이</strong>를 바쳐 그의 <strong>이</strong>목을 즐겁게 하며, 억지로 임금의<br />
뜻에 맞추어 그를 즐겁게 만들어 주되 그 뒤에 닥쳐올 해악은 돌<br />
아보지도 않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諛臣<strong>이</strong>다. 셋째, 속<strong>이</strong><br />
진실로 자못 험악하면서 밖으로는 소심하고 근엄<strong>한</strong> 척하여 巧言令<br />
色하며, 또<strong>한</strong> 마음속으로 어진 <strong>이</strong>를 질투하여 자신<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가고 싶으<br />
면 그 아름다움을 극구 칭찬하되 자신의 단점은 끝까지 은폐하고<br />
남을 물러<strong>나</strong>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점을 들추어내고 그 장점은<br />
숨기는 것<strong>이</strong>다. 그리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망령된 행동과 잘못된<br />
등용을 하도록 하고, 상벌도 부당하게 내리도록 만들며, 법령도 제<br />
대로 실행되지 못하게 하고 마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간<br />
신<strong>이</strong>다. 넷째, 지혜는 족히 그 잘못도 변호하여 옮은 듯<strong>이</strong> 느끼게<br />
하며 언변도 풍족하여 남을 혹하게 하며, 뒤집으면 쉬운 말인데도<br />
<strong>이</strong>를 위대<strong>한</strong> 문장처럼 떠벌리며, 안으로는 骨肉之親을 <strong>이</strong>간시키고,<br />
밖으로는 종정에 질투와 혼란의 풍조를 만드는 거<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br />
하는 자는 참신<strong>이</strong>다. 다섯째, 권세를 專斷하여 국가의 대사를 빌미<br />
로 <strong>나</strong>라는 가벼<strong>이</strong> 여기고 자신의 私利私慾은 중히 여기며, 당을<br />
조직하여 자기 집을 부유하게 <strong>한</strong>다. 도 그 권세를 더욱 높여 임금<br />
의 명령을 제멋대로 비틀어 자신<strong>이</strong> 顯貴하도록 꾸미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br />
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賊臣<strong>이</strong>다. 여섯째, 사악<strong>한</strong> 도리를 가지고 아첨<br />
하며 임금의 의를 추락시키고, 作黨比周하여 임금의 명철을 가로<br />
막아 들어와서는 辯言好辭로 자신을 보호하며, 밖으로는 다른 말<br />
로 혹하게 하여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비를 가릴 수<br />
없도록 <strong>한</strong>다. 눈치로 일을 추진하여 세력 있는 곳<strong>이</strong>면 빌붙어, 소<br />
문<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도록 하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와 같<strong>이</strong> 하는 자는 亡國之臣<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br />
상 여섯 가지가 바로 육사<strong>이</strong>다. 따라서 현신은 육정지도로 처신하<br />
여 육사지술을 배격해야 <strong>한</strong>다. 그렇게 하면 위는 편안하고 아래는<br />
- 31 -
잘 다스려져서 살아서는 즐거운 것을 볼 것<strong>이</strong>요, 죽어서도 사모함<br />
을 받을 것<strong>이</strong>니라.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바로 신하된 자의 도리와 처신술<strong>이</strong>다.<br />
人臣之術, 順從而復命, 無所敢專. 義不苟合, 位不苟尊; 必有益於國,<br />
必有補於君; 故其身尊而子孫保之. 故人臣之行有六正六邪, 行六正則<br />
榮, 犯六邪則辱, 夫榮辱者, 禍福之門也. 何謂六正六邪? 六正者: 一<br />
曰萌芽未動, 形兆未見, 昭然獨見在亡之幾, 得失之要, 預禁乎不然之<br />
前, 使主超然立乎顯榮之號, 天下稱孝焉. 如此者聖臣也. 二曰虛心白<br />
意, 進善通道, 勉主以禮誼, 諭主以長策, 將順其美, 匡救其惡, 功成事<br />
立, 歸善於君, 不敢獨伐其勞, 如此者良臣也. 三曰卑身賤體, 夙與夜<br />
寐, 進賢不解, 數稱於往古之德行, 事以厲主意, 庶幾有益, 以安國家<br />
社稷宗廟, 如此者忠臣也. 四曰明察 , 見成敗, 早防而救之, 引而復之,<br />
塞其間, 絶其源, 轉禍以爲福, 使君終以無憂, 如此者智臣也. 五曰守<br />
文奉法, 任官識事, 辭祿讓賜, 不受贈遣, 衣服端齊, 飮食節儉, 如此者<br />
貞臣也. 六曰國家昏亂, 所爲不道, 然而敢犯主之顔面, 言主之過失,<br />
不辭其誅, 身死國安, 不悔所行, 如此者直臣也, 是爲六正也. 六邪者:<br />
一曰安官貧祿, 營於私家, 不務公事, 懷其智, 藏其能, 主飢於論, 渴於<br />
策, 猶不肯盡節, 容容乎與世沈浮上下, 左右觀望, 如此者具臣也. 二<br />
曰主所言皆曰善, 主所爲皆曰可, 陰而求主之所好卽進之, 以快主耳目,<br />
兪合苟容與主爲樂, 不顧其後害, 如此者諛臣也. 三曰中實頗險, 外容<br />
貌小謹, 巧言令色, 又心嫉賢, 所欲進則明其美而陰其惡, 所欲退則明<br />
其過而 其美. 使主妄行過任, 賞罰不當, 號令不行, 如此者姦臣也. 四<br />
曰智足以 非, 辯足以行說, 反言易辭而成文章, 內離骨肉之親, 外妬亂<br />
朝廷, 如此者讒臣也. 五曰專權 勢, 特招國事, 以爲輕, 重於私門, 成<br />
黨以富其家, 又復增加威勢, 嬌主命以自貴顯, 如此者賊臣也. 六曰 言<br />
以邪, 墜主不義, 朋黨比周, 以蔽主命, 入則辯言好辭, 出則更復異其<br />
言語, 使白黑無別, 是非無間, 伺候可堆, 因而富然, 使主惡布於境內,<br />
聞於四隣, 如此者亡國之臣也, 是謂六邪. 賢臣處六正之道, 不行六邪<br />
之術, 故上安而不治, 生則見樂, 死則見思, 此人臣之術也. 12)<br />
12) 上揭書 - 「 2卷 臣術 1章 」P.59<br />
- 32 -
예문에서도 말하고 있듯 좋은 신하는 임금의 의를 드러내고 임금<br />
<strong>이</strong> 德治를 할 수 있게끔 돕고 임금<strong>이</strong> 바른 길에 서지 않을 때는 죽<br />
음을 무릅쓰고라도 諫言하는 신하를 말<strong>한</strong>다. 신하된 자들은 곧 선비<br />
<strong>이</strong>기도 하다. <strong>이</strong>들은 항상 道, 德, 仁, 義에 근거하여 의를 알아 자신<br />
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일에 공을 세우되 그 상을 독점하지 않으며,<br />
정치에는 충실하고 간언에는 강경하여 간사함<strong>이</strong> 없어야 <strong>한</strong>다. 또 사<br />
보다는 공을 앞세우고 언어에는 법도가 있어야 <strong>한</strong>다. 앞서 말<strong>한</strong> 道,<br />
德, 仁, 義가 바르게 사는것<strong>이</strong> 곧 천하가 바르게 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를 갖춘 신하는 왕도 함부로 신하로 여길 수 없는 신하들<strong>이</strong>다. 13)<br />
그리고 어진 사람을 알아보고 왕에게 천거하는 자라면 더 <strong>이</strong>상 훌<br />
륭<strong>한</strong> 신하는 없을 것<strong>이</strong>다.<br />
(3). ≪說苑≫속의 君子 形象<br />
임금은 신하로 근본을 삼고 신하는 그 임금을 근본으로 삼으며<br />
아버지는 아들을 근본으로 삼고 아들은 아버지를 근본으로 삼는다<br />
면 <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라는 근본<strong>이</strong> 바로 선 매우 훌륭<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라라 할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러<br />
<strong>한</strong> 근본을 버리면 榮華도 시들고 말 것<strong>이</strong>다.<br />
아버지로서의 도리는 聖<strong>이</strong>고 , 자식된 도리는 仁, 임금의 도는 義,<br />
신하의 도는 忠<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 도리를 지키며 사는 자를 군자라 할 것<strong>이</strong>다. 자식된 자로 仁과<br />
孝를 다하는 자면 그는 군자인 것<strong>이</strong>다.<br />
13) 上揭書 - 「 2卷 臣術 2章 」<br />
- 33 -
孔子는 여섯 가지 근본을 세운 뒤에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말하였<br />
다. 몸을 일으켜 세우는 義는 孝를 근본으로 삼고, 또 喪을 당하여<br />
갖추어야 할 예는 哀가 그 근본<strong>이</strong>며, 전쟁에서 무리지어 싸울 때는<br />
勇<strong>이</strong> 근본<strong>이</strong>다. 그리고 정치를 하여 다스림에는 農<strong>이</strong> 근본<strong>이</strong>며, <strong>나</strong><br />
라에 벼슬을 하면서 갖추어야 할 예로는 嗣가 근본<strong>이</strong>다. 또 재주 있<br />
는 인물<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는 때가 있으니, 스스로는 力을 근본으로 삼아야 <strong>한</strong>다.<br />
근본을 버려 두고 공고히 하지 못하면서 끝만 풍성하게 하려들지<br />
말고 친척 사<strong>이</strong>를 먼저 화목하게 해 놓지 못했다면 바깥 사귐에 힘<br />
쓸 것<strong>이</strong> 아니다. 일의 終始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많은 사업<br />
을 벌<strong>이</strong>는 데 힘쓸 일<strong>이</strong> 아니다. 마찬가지로 듣고 기억<strong>한</strong> 것을 잘<br />
전달 할 수 없다면 쓸데없는 말을 많<strong>이</strong> 하고자 서둘지 말 것<strong>이</strong>고<br />
가까운 사람들과 제대로 平하지 못했을 때는 먼데 사람에게 인정<br />
받으려 덤비지 말아야 <strong>한</strong>다. 다시 말해 가까운 것부터 잘 닦는 것<strong>이</strong><br />
군자가 할 도리<strong>이</strong>다. 14)<br />
≪說苑≫중에 <strong>한</strong> 고사를 예를 들어 보고자 <strong>한</strong>다.<br />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본에 힘쓸지니 본<strong>이</strong> 서면 도가 생긴<br />
다.」무릇 근본<strong>이</strong> 바르지 못<strong>한</strong> 것은 그 끝<strong>이</strong> 반드시 기울게 되고,<br />
시작<strong>이</strong> 승성하지 못하면 그 끝<strong>이</strong> 반드시 쇠갈하게 마련<strong>이</strong>다. 그래<br />
서 시에『언덕<strong>이</strong> 평평하면 그 샘물도 흘러 맑기 마련일세!』라고<br />
하였던 것<strong>이</strong>다. 『본<strong>이</strong> 서면 길<strong>이</strong> 생긴다.』라는 말은 춘추의 의<strong>이</strong><br />
다.<br />
봄에 씨를 뿌려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거둘 것<strong>이</strong> 없어 어지러워<br />
지는 일<strong>이</strong> 없듯<strong>이</strong>, 임금의 도리를 바르게 지키는 자는 국가가 위<br />
험해질 리가 없다. 역에는 『그 근본을 바르게 세우면 만물<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br />
치대로 다스려진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를 털끝만큼<strong>이</strong>라도 놓치면 그 결과<br />
와의 차<strong>이</strong>는 1천리<strong>나</strong> 된다.』라고 하였다. <strong>이</strong> 까닭으로 군자는 그<br />
14) 上揭書 - 「 3卷 建本 4章 」P.99 중에서<br />
- 34 -
근본 세우기를 귀하게 여기며, 그 시작 세우기를 중히 여긴다.<br />
孔子曰 : 「君子務本, 本立而道生.」夫本不正者末必倚, 始不盛者終<br />
必衰. 詩云 : 『原隰旣平, 泉流旣淸.』本立而道生, 春秋之義 : 有正<br />
春者無亂秋, 有正君者無危國, 易曰 : 『建其本而萬物理, 失之毫釐,<br />
差以千里.』是故君子貴建本而重立始. 15)<br />
예문을 보면 유향<strong>이</strong> 생각하는 군자 역시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br />
말로 요약 정리가 된다. 자기의 가까운 것부터 세워<strong>나</strong>가고 그 도리<br />
를 받들어 지키는 사람<strong>이</strong> 君子<strong>이</strong>다. 또<strong>한</strong> 많<strong>이</strong> 배우도 들어 마음을<br />
가꿔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strong>이</strong> 군자다.<br />
지금까지 ≪說苑≫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劉<br />
向<strong>이</strong> 강조<strong>한</strong> 바와 같<strong>이</strong> 선왕들의 사례를 통해 왕을 향<strong>한</strong> 권고와 전<br />
시대의 신하들의 모습<strong>이</strong> 주를 <strong>이</strong>룬다.<br />
왕은 대부분 선정을 베풀었던 왕<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오는데 ≪說苑≫의 고사 중<br />
에서는 <strong>나</strong>라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왕의 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었<br />
다. 왕의 資質을 惡評하기 보다는 부족함<strong>이</strong>라 표현하였고 그런 왕들<br />
곁에는 항상 훌륭<strong>한</strong> 신하가 있어 망국의 길을 걷지는 않았다. 왕에<br />
게 있어서 劉向의 관대<strong>한</strong> 시선을 느낄 수 있다. <strong>이</strong>는 유향 자신<strong>이</strong><br />
황족 출신<strong>이</strong>기 때문<strong>이</strong>고 <strong>이</strong>전의 혼란<strong>한</strong> 정치를 딛고 王權의 强化와<br />
德治를 바라는 간절<strong>한</strong> 마음<strong>이</strong> 느껴진다.<br />
또<strong>한</strong> 유향<strong>이</strong> 諫大夫를 지냈음을 다시 <strong>한</strong>번 알게 하는 것은 고사<br />
대부분<strong>이</strong> 간언하는 신하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 임금의 잘<br />
못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 신하는 邪臣<strong>이</strong>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br />
또<strong>한</strong> 군자의 모습에서는 대부분 공자의 언문을 취하고 있는데 <strong>이</strong><br />
는 자신의 사상과 철학에 근간<strong>이</strong> 되는 공자를 향<strong>한</strong> 신뢰가 있기 때<br />
15) 上揭書 - 「 3卷 建本 1章 」P.97<br />
- 35 -
문 일 것<strong>이</strong>다. 또 고사 곳곳에서 살아서는 크게 평가받지 못하였던<br />
공자의 고사가 <strong>나</strong>타<strong>나</strong>는데 <strong>이</strong>는 자신들의 聖敎로까지 추앙받던 공<br />
자가 살아서는 받아주는 곳 없<strong>이</strong> 쓰임 받지 못<strong>한</strong> 것에 대<strong>한</strong> 안타까<br />
움과 애정<strong>이</strong> 느껴지는 부분<strong>이</strong>다.<br />
第2節. 篇目上의 分類<br />
≪說苑≫은 총 20개의 소제목을 가진 卷으로 <strong>나</strong>뉘어 있다. 각 편<br />
마다 제목에 어울리는 즉 통일된 내용의 고사들<strong>이</strong> 20여章에서 많게<br />
는 200餘章에 소개되어 있다.<br />
<strong>이</strong>를 각 卷마다 중심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그 중 가장 주제가 극<br />
명하게 드러난 고사를 예로 들어 보려 <strong>한</strong>다.<br />
1卷「君道」篇은 총 46章으로 임금의 道에 대해 <strong>이</strong>야기하고 있다.<br />
≪說苑≫에서 말하는 왕은 정말 <strong>이</strong>렇게 할 수 있는 사람<strong>이</strong> 있을까<br />
라는 생각<strong>이</strong> 들 정도로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 <strong>나</strong><br />
라를 잘 다스리려면 왕과 신하 사직<strong>이</strong> 정비되고 바로 서야 함을 말<br />
하고 있는데, 제발 <strong>이</strong> ≪說苑≫을 현 정치인들<strong>이</strong> 읽어주었으면 하는<br />
바램<strong>이</strong> 들 정도<strong>이</strong>다.<br />
현명<strong>한</strong> 사람은 현명<strong>한</strong> 사람을 알아본다고 현명<strong>한</strong> 신하를 곁에 둘<br />
줄 알아야 하며 곁에만 두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그에 적합<strong>한</strong> 벼슬을 주어<br />
야 하고 공을 세웠다면 그에 맞는 보답까지 후하게 하여 다른 선비<br />
들로 하여금 임금을 흠모하고 쓰임 받음을 원하도록 만드는 그런<br />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 또 신하의 간언을 흘려 듣지 않고 간언을<br />
- 36 -
듣고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왕의 모습을 보<strong>이</strong>고 있다.<br />
그뿐 아니라 매일 향락 속에서 살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것<strong>이</strong> 아<br />
니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도록 公堂에서 내려오지 않고 열심히<br />
정사를 돌보며 상을 당<strong>한</strong> 사람은 위로하고 굶주린 사람은 찾아 돌<br />
보는, 다시 말해 임금<strong>이</strong> 있고 백성<strong>이</strong> 있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백성<strong>이</strong> 있어<br />
야 임금<strong>이</strong> 있다는 유교적 정치 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br />
있다.<br />
晉<strong>나</strong>라 平公<strong>이</strong> 師曠에게 물었다. 「人君之道는 어떠해야 합니<br />
까?」<strong>이</strong>에 사광은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 「임금의 도는 淸淨無爲해<br />
야 하며, 博愛에 힘써야 하며, 流俗에 빠져들어서도 안 되며, 좌우<br />
측근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과와 실적을 자주<br />
살피고 헤아려 <strong>이</strong>로써 공정하게 신하를 대해야 합니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임<br />
금된 자가 지녀야 할 操道입니다.」평공<strong>이</strong> 「훌륭하다」라고 하였<br />
다. (晉平公問於師曠曰 : 「人君之道, 如何?」對曰 : 「人君之道,<br />
淸淨無爲, 務在博愛, 趨在任賢 ; 廣開耳目, 以察萬方; 不溷溺於流俗,<br />
不拘繫於左右; 廓然遠見, 踔然獨立 ; 屢省考績, 以臨臣下. 此人君之<br />
操也.」 平公曰 : 「善」 16)<br />
<strong>이</strong> 예문에서 보<strong>이</strong>는 바와 같<strong>이</strong> 임금<strong>이</strong>라 하면 행실<strong>이</strong> 투명하여 꾸<br />
밈<strong>이</strong> 없어야 하며 아집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만을 펼치는 것<strong>이</strong> 아<br />
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strong>한</strong> 넓게 볼 줄 알아야 <strong>한</strong>다. 높은<br />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항상 자신의 과실<br />
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strong>한</strong> 마음을 갖고 있어야 <strong>한</strong>다.<br />
현명하며 훌륭<strong>한</strong> 성품을 가진 임금<strong>이</strong>라면 자연히 주변에 좋은 신<br />
하들<strong>이</strong> 모<strong>이</strong>게 되고 그들의 간언을 듣고 실행할 수 있는 왕<strong>이</strong>라면<br />
16) 上揭書 - 「 1卷 君道 1章 」P.3<br />
- 37 -
정말 훌륭<strong>한</strong> 왕<strong>이</strong>다.<br />
훌륭<strong>한</strong> 신하를 곁에 두려면 공정하게 신하를 대해야 함은 당연<strong>한</strong><br />
일<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런 능력을 두루 갖추어야 사람을 부릴 수 있으며 정치를<br />
<strong>이</strong>끌어 <strong>나</strong>갈 수 있는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說苑≫에서 강조되는 왕의 모습<strong>이</strong>며 올바른 정치의 모습<br />
<strong>이</strong>기도 하다.<br />
2卷「臣術」篇은 25章으로 되어 있으며 신하된 자의 도리에 대<br />
해 말하고 있다. ≪說苑≫에서 말하는 신하의 도리란 임금의 덕을<br />
더 두텁게 하고 입금의 인<strong>이</strong> 상하지 않도록 보필하는 사람을 말<strong>한</strong><br />
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strong>이</strong> 王道라면 일을 알고 하는 것은 臣道라고<br />
말하고 있어 임금과 신하의 역할을 확연하게 구별해주고 있다.<br />
신하된 자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임금의 과실을 지적해 주어야<br />
<strong>한</strong>다. 또 어진 사람<strong>이</strong> 어진 사람을 천거할 줄 안다고 자기만 임금<br />
옆에 있기를 원하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현명<strong>한</strong> 사람을 만<strong>나</strong>면 언제고 임<br />
금에게 말해 임금<strong>이</strong> 그를 스승<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친구로 삼도록 해야 함을 말하<br />
고 있다.<br />
또 자기의 <strong>이</strong>름으로 仁을 베풀어 임금의 仁을 가리지 않도록 당부<br />
하고 있다.<br />
齊候가 晏子에게 물었다.<br />
「충신<strong>이</strong> 그 임금을 섬김은 어떠해야 합니까?」<br />
그러자 안자는 간단하게 「임금<strong>이</strong> 難을 만<strong>나</strong>도 따라 죽지 않고,<br />
임금<strong>이</strong> 도망갈 때 그를 따라가 주지 않는 것<strong>이</strong>지요!」라고 했다.<br />
경공<strong>이</strong> 의아해서 물어다. 「땅을 떼어 봉해 주고 작위를 <strong>나</strong>누어<br />
귀하게 해준 신하인데, 왕<strong>이</strong> 어려움에 빠져도 같<strong>이</strong> 죽지 않고, 왕<br />
<strong>이</strong> 도망 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strong>이</strong>를 따라 주지 않는다니, 어찌<br />
<strong>이</strong>를 忠<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소?」그러자 안자는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신<br />
- 38 -
하로서 좋은 말을 해서 임금에게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strong>나</strong>라에는<br />
종신토록 환난<strong>이</strong> 없을 것<strong>이</strong>니, 신하가 죽을 일<strong>이</strong> 어디 있겠습니<br />
까? 또 계책을 일러 같<strong>이</strong> 주어 그것<strong>이</strong> 채택되면 그런 <strong>나</strong>라에는 임<br />
금<strong>이</strong> 도망할 일<strong>이</strong> 없을 텐데, 신하가 같<strong>이</strong> 따라가 줄 일<strong>이</strong> 무엇<strong>이</strong><br />
있겠습니까? 또 좋은 말을 해주었는데 임금<strong>이</strong> 받아 주지 않아 환<br />
난<strong>이</strong> 생겼을 때 따라 죽는 것은 헛된 죽음, 즉 妄死일 뿐<strong>이</strong>며, 잘<br />
못을 바로잡을 諫言을 해주어도 듣지 않다가 임금<strong>이</strong> 도망가는 꼴<br />
<strong>이</strong> 생겼을 때 <strong>이</strong>를 따라가는 것은 속임수에 불과<strong>한</strong> 것입니다. 그<br />
래서 충신<strong>이</strong>란 능히 좋은 말을 임금<strong>이</strong> 듣도록 해주는 자<strong>이</strong>기 임금<br />
을 환난에 빠뜨리는 자가 아닙니다.」<br />
( 齊侯問於晏子曰: 「忠臣之事其君, 何若?」 對曰: 「有難不死, 出<br />
亡不送.」 君曰: 「裂地而封之, 蔬爵而貴之; 吾有難不死, 出亡不送,<br />
可謂忠乎?」對曰: 「言而見用, 終身無難, 臣何死焉? 謀而見從, 終<br />
身不亡 臣何送焉? 若言不見用, 有難而死之, 是妄死也; 諫而不見從,<br />
出亡送, 是詐爲也. 故忠臣者, 能納善於君, 而不能與君陷難者也.<br />
」) 17)<br />
2卷에서 말하고 있는 ‘臣下의 道’는 임금의 길과는 엄격하게 구분<br />
되어 있다. <strong>이</strong> 예문에서처럼 훌륭<strong>한</strong> 신하란 임금<strong>이</strong> 바른 정치를 할<br />
수 있게 해주는 사람<strong>이</strong>다. <strong>나</strong>라가 망<strong>한</strong>다고 임금을 따라 죽는 것<strong>이</strong><br />
忠<strong>이</strong> 아니다. 그 전에 <strong>나</strong>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는 신하가 정말 훌륭<br />
<strong>한</strong> 신하<strong>이</strong>며 2권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br />
3卷「建本」篇은 30章으로 인생을 살면서 근본<strong>이</strong> 되는 것 내지<br />
는 바른 삶을 살기 위<strong>한</strong> 조건<strong>이</strong>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근본<strong>이</strong> 바로<br />
선 뒤에 덕도 서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며 근본을 바로 세우지 않는<br />
다면 끝에 가서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임금은<br />
17) 上揭書 -「 2卷 臣術 12章」P. 77<br />
- 39 -
신하를 근본으로 삼을 것<strong>이</strong>며 신하는 임금을 근본으로 삼을 것<strong>이</strong>다.<br />
또 아버지는 아들을 근본으로 삼고 아들은 그 아버지를 근본으로<br />
삼을 것<strong>이</strong>다. 18) 忠과 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br />
또 배움<strong>이</strong>란 것<strong>이</strong> 살면서 얼마<strong>나</strong> 중요<strong>한</strong>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어<br />
린 아<strong>이</strong>일 때 가르침<strong>이</strong> 있어야 어른<strong>이</strong> 되어서 덕을 갖춘다고 말함<br />
으로 배움 자체가 인생사의 근본<strong>이</strong> 됨을 얘기하고 있다. 또<strong>한</strong> 배움<br />
<strong>이</strong>라는 것은 특정 때가 있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죽음을 당할 때까지 <strong>이</strong>루<br />
어져야 <strong>한</strong> 다고 말하고 있다. 19)<br />
하지만 <strong>이</strong>렇게 배움<strong>이</strong>란 <strong>나</strong>라와 사람의 근본<strong>이</strong> 되지만 창고가 가<br />
득<strong>한</strong> 후에야 예절을 알고 의식<strong>이</strong> 풍족해야 영욕을 알게된다. 부유해<br />
진 후에 교육을 베푸는 것<strong>이</strong> 治國의 根本<strong>이</strong>라고 말하고 있다. <strong>이</strong>것<br />
은 ‘가난하면 배움<strong>이</strong> 크게 필요 없다’ 는 뜻도 아니고 부유할 때에<strong>나</strong><br />
배움을 논할 정도로 의식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말도 아니다.<br />
정치란 백성을 배불리 먹<strong>이</strong>는 것<strong>이</strong> 가장 중요<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다. 가난<strong>한</strong> 상<br />
태에서 아무리 좋은 선생<strong>이</strong> 지도를 <strong>한</strong>다고 하여도 교육적 효과가<br />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인 것<strong>이</strong> 먼저 해결<strong>이</strong> 되었을 때 교육<br />
을 시킬 수 있음을 말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齊 桓公<strong>이</strong> 管仲에게 물었다. 「왕은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br />
까?」「하늘을 귀하게 여겨야지요.」<strong>이</strong> 말에 환공은 고개를 들어<br />
하늘을 쳐다보는 것<strong>이</strong>었다. 그러자 환공<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 「제<br />
가 말<strong>한</strong> 하늘<strong>이</strong>란 창창하고 망망<strong>한</strong> 저 하늘을 말하는 것<strong>이</strong> 아닙니<br />
다. 임금된 자는 바로 백성을 하늘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백성<strong>이</strong><br />
임금과 함께 하면 편안할 것<strong>이</strong>요, 백성<strong>이</strong> 임금을 도와 주면 강해<br />
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태해지고, 백성<strong>이</strong> 임금에게 등을<br />
돌리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시에 『백성들에게 선량함<strong>이</strong> 없게<br />
18) 上揭書 - 「 3卷 建本 4章 」P.99 중에서<br />
19) 上揭書 - 「 3卷 建本 17章 」P. 115 중에서<br />
- 40 -
되면 서로가 <strong>한</strong>쪽으로만 미워하네!』라고 하였다. 백성들<strong>이</strong> 윗사람<br />
을 원망하는데도 망하지 않는 자는 있을 수 없다.(齊桓公問管仲曰<br />
: 「王者何貴?」曰 : 「貴天.」桓公仰而視天, 管仲曰 : 「所謂天者,<br />
非謂蒼蒼莽莽之天也 ; 君人者以百姓爲天, 百姓與之則安, 轉之則彊,<br />
非之則危, 背之則亡. 」詩云 : 『人而無良, 相怨一方.』民怨其上, 不<br />
遂亡者, 未之有也. 20)<br />
위 예문에서는 왕으로서 治道에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하고<br />
있다. 왕은 하늘을 귀히 여기는데 하늘은 백성을 말하는 것<strong>이</strong>다. 백<br />
성을 귀하게 여기면 백성 또<strong>한</strong> 임금과 함께 하여 서로 도우려 해<br />
成하는 <strong>나</strong>라가 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처럼 本<strong>이</strong> 서면 道가 생기고 근본을 세우면 만물<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치대로 다<br />
스려 진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예문과 더불어 3卷에서 계속적으로 보<strong>이</strong>는 내<br />
용<strong>이</strong>다.<br />
4卷「立節」篇은 24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다. 주된 등장인물은 왕<strong>이</strong><br />
아니라 신하된 사람들<strong>이</strong>다. 다시 말해 절개 꼿꼿<strong>한</strong> 선비를 떠올리게<br />
하는 고사들로 ‘의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strong>이</strong>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br />
어떤 녹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그 녹<strong>이</strong> 해당하는 일로 죽어야 <strong>한</strong><br />
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지는 않는<br />
다. 예를 들어 諫言하는 趙宣子를 미워<strong>한</strong> 晉의 포악<strong>한</strong> 왕 靈公<strong>이</strong> 趙<br />
宣子를 죽<strong>이</strong>려 사람을 보냈으<strong>나</strong> 도리어 아침부터 단정<strong>한</strong> 조선자의<br />
모습을 보고 忠과 信을 저버릴 바엔 자결함<strong>이</strong> 낫다하고 자결하였다<br />
<strong>한</strong>다.<br />
<strong>이</strong>처럼 신하된 사람들<strong>이</strong> 등장하며 유교적 <strong>이</strong>념을 드러낸다 하지만<br />
忠만<strong>이</strong> 신하의 의<strong>이</strong>라고 말하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다. 본인에게 의라고 생각<br />
20) 上揭書 - 「 3卷 建本 25章 」P.121<br />
- 41 -
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자신의 세운 뜻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br />
曾子가 다 해어진 옷을 입고 밭을 갈고 있었다.<br />
魯君<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를 가엾게 여겨 사람을 시켜 邑 하<strong>나</strong>를 그에게 주면서,<br />
「<strong>이</strong>를 가지고 그대의 옷<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꿰매 입으시오!」라고 하였다. 증자<br />
는 거절했다. 다시 반복해서 왔지만 또<strong>한</strong> 받지 않아다. 그러자 심<br />
부름 온 <strong>이</strong>가 물었다.「선생님께서는 남에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br />
남<strong>이</strong> 주고 있습니다. 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까?」<br />
증자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듣자 하니 남에게 무엇인가를<br />
받은 사람은 그에게 준 사람을 敬畏하게 되고, 남에게 무엇인가를<br />
준 사람은 알게 모르게 거만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오. 비록 상대<br />
가 <strong>나</strong>에게 주면서 전혀 거만하지 않게 <strong>한</strong>다고 해도 내가 어찌 능<br />
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br />
그리고는 끝내 받지 않았다. 孔子가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 <strong>이</strong>렇게 평하였<br />
다. 「曾參의 말대로만 하면 자신의 절조를 보전하기에 족하리<br />
라!」<br />
( 曾子衣弊衣以耕, 魯君使人往致邑焉, 曰: 「請以此蓚衣.」曾子不<br />
受, 反復往, 又不受, 使者曰: 「先生非求於人, 人則獻之, 系爲不<br />
受?」曾子曰: 「臣聞之, 受人者畏人, 予人者驕人; 縱子有賜不我驕<br />
也, 我能勿畏乎?」 終不受. 孔子聞之曰: 「 參之言, 足以全其節<br />
也.」) 21)<br />
<strong>이</strong>처럼 무엇인가를 남에게 받으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치뤄야 <strong>한</strong><br />
다. 준 사람은 대가를 요구하는 맘<strong>이</strong> 생기고 받은 사람 역시 떳떳<strong>한</strong><br />
마음<strong>이</strong>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strong>이</strong> 뜻을 세웠다면 어떤 것 앞에<br />
서도 굽히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strong>이</strong> 예문에서 특히 <strong>이</strong>런 모습<strong>이</strong><br />
강조되고 있다.<br />
21) 上揭書 - 「4卷 立節 6章」P.136<br />
- 42 -
5卷「貴德」篇은 30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다. 5篇의 제목을 그대로 <strong>이</strong><br />
해<strong>한</strong>다면 ‘德을 귀하게 여기다’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貴德」편에<br />
서는 德있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br />
德을 가진 왕은 은혜를 백성에게 베풀고도 보답을 바라는 것<strong>이</strong> 아<br />
니고 어진 사람을 대하는 것은 즐겁게 하며 불초<strong>한</strong> 사람은 불쌍히<br />
여기는 것은 <strong>나</strong>라의 근본<strong>이</strong>자 왕으로서의 덕<strong>이</strong>며 왕<strong>이</strong> 될 자의 근<br />
본<strong>이</strong>다. 백성을 아껴서 백성<strong>이</strong> 농사짓는 시기에는 宮室을 새로 짓는<br />
일<strong>이</strong> 없도록 하고 그 덕<strong>이</strong> 풍성하여 골고루 먼 곳까지 전해져야 <strong>한</strong><br />
다. 덕<strong>이</strong> 적은 자가 왕<strong>이</strong> 되면 그 <strong>나</strong>라에는 근심<strong>이</strong> 많아진다고 하였<br />
다.<br />
또<strong>한</strong> 군자는 작은 일에 부지런히 하여 큰 환난을 미리 막도록 하<br />
는 사람<strong>이</strong>며 利를 멀리하고 德을 가까<strong>이</strong> 하는 사람<strong>이</strong>다.<br />
楚王<strong>이</strong> 莊辛에게 물었다. 「군자의 행동은 어떠해야 합니까?」<br />
장신의 대답은 <strong>이</strong>러하였다. 「사는 집에 사방의 담장<strong>이</strong> 없어야<br />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을 다 들여다보게 하여 훼<br />
방하는 말<strong>이</strong>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행동에는 사방에 접근하지<br />
못하게 하는 護衛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strong>이</strong> 그에게<br />
폭행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군자의 행동입니다.」<br />
초왕<strong>이</strong> 다시 물었다. 「그럼 군자로서 부유하면 어찌해야 합니<br />
까?」장신은 다시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 「군자로서 부유하다면 남<br />
에게 빌려 주고 <strong>나</strong>서도 그들<strong>이</strong> 덕스럽게 여겨 주지 않는다고 해서<br />
<strong>이</strong>를 책하지 않으며, 남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되 그들을 시키<br />
거<strong>나</strong>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친척<strong>이</strong> 그를 사랑하고, 많은 사람<br />
들<strong>이</strong> 그를 추대하여 불초<strong>한</strong> 자라도 그를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br />
모두가 즐겁게 오래 살아 환난<strong>이</strong> 그를 다치게 하지 않기를 바라게<br />
됩니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군자로서 자신의 부를 쓰는 방법입니다.」<br />
- 43 -
초왕은 <strong>이</strong> 말에 「훌륭하다」라고 하였다.<br />
( 楚王問莊辛曰 : 「君子之行奈何?」 莊辛對曰 : 「居不爲垣牆, 人<br />
莫能毁傷 ; 行不從周衛, 人莫能暴害. 此君子之行也.」 楚王復問 :<br />
「君子之富奈何?」 對曰 : 「君子之富, 假貸人不德也, 不責也 ; 其<br />
食飮人不使也, 不役也 ; 親戚愛之, 衆人喜之, 不肖者事之 ; 皆欲其<br />
壽樂而不傷於惠. 此君子之富也.」 楚王曰 : 「善.」) 22)<br />
貴德<strong>이</strong>라 하는 것은 임금으로의 덕과 군자로의 덕 그 둘을 말<strong>한</strong>다.<br />
왕은 백성을 아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보답을 바랄 것<strong>이</strong><br />
아니고 군자는 <strong>이</strong>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5卷의 모든 고사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러<br />
<strong>한</strong> 내용으로 통일되고 있다.<br />
6卷「復恩」篇은 총 29章의 고사로 <strong>이</strong>루어졌으며 은혜를 베푸는<br />
것과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모두를 얘기하고 있다. ‘陰德陽報’란<br />
말<strong>이</strong>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strong>이</strong>지 않는 곳에 덕을 행<strong>한</strong>다 하<br />
여도 겉으로 드러남을 말하고 있다. 덕을 행하면 그것<strong>이</strong> 자신에게<br />
아니면 후세에게라도 보은<strong>이</strong>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br />
왕<strong>이</strong> 된 자가 자기보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면 언젠가 그 덕<br />
분에 목숨을 건지게 된다. 하지만 왕으로 신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br />
할 때는 그 시기를 적절히 해야하고 또 그 공덕에 맞게 해야<strong>한</strong>다.<br />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상을 주지 않는 것<strong>이</strong> 더 <strong>나</strong>을 것<strong>이</strong>다.<br />
하지만 은혜를 베풀음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베푼 만큼 <strong>나</strong>에게도<br />
돌아올 것<strong>이</strong>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은혜란 베풀기는<br />
<strong>이</strong>곳에 하였어도 보답은 다른 곳에서 <strong>나</strong>올 수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 또 어<br />
진 사람<strong>이</strong>어야 보답할 줄도 안다.<br />
22) 上揭書 - 「5卷 貴德 22章」P.190<br />
- 44 -
秦 穆公<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번은 밖에 <strong>나</strong>갔다가 그만 자신<strong>이</strong> 아기는 駿馬가 도<br />
망쳐 버리는 일을 당하고 말았다. 스스로 <strong>나</strong>서서 그 말<strong>이</strong> 도망 간<br />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사람들<strong>이</strong> 그 말을 잡아 <strong>이</strong>제 막 <strong>나</strong>누어 먹<br />
고 있었다. 목공<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를 보고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바로 내가 잃었던 그 준마<br />
로다」라고 하자, 모두가 놀라 두려워하며 일어섰다.<br />
그러자 목공<strong>이</strong> 「내 듣자 하니 준마의 고기를 먹은 자는 술을 함<br />
께 먹지 않으면 사람을 죽<strong>이</strong>게 된다더라」하면서 즉시 뒤따라 술<br />
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말을 죽인 자들은 모두가 부끄러워하며 떠<br />
났다. 그로부터 3년<strong>이</strong> 흐른 후, 晉<strong>나</strong>라가 <strong>이</strong> 秦 목공을 공격하여<br />
그를 에워싸서 포위를 당하게 되었다. <strong>이</strong>때 지난날 말을 잡아먹었<br />
던 사람들<strong>이</strong> 서로 상의하기를 「가히 말을 잡아먹었을 때 술까지<br />
내려 주었던 그 은혜에 죽음으로써 보답하러 <strong>나</strong>설 기회로다!」하<br />
고 <strong>나</strong>서서 그 晉<strong>나</strong>라의 포위를 무너뜨려 주었다. 목공은 마침내<br />
그 어려움을 풀었음은 물론 오히려 晉 惠公을 사로잡아 귀국하게<br />
되었다. <strong>이</strong>는 바로 덕을 베풀어 복<strong>이</strong> 되돌아온 예<strong>이</strong>다.<br />
( 秦穆公嘗出而亡其駿馬, 自往求之, 見人已殺其馬, 方共食其肉, 穆<br />
公謂曰 : 「是吾駿馬也.」諸人皆懼而起, 穆公曰 : 「吾聞食駿馬肉,<br />
不飮酒者殺人.」 卽以次飮之酒, 殺馬者, 皆慙而去. 居三年, 晉攻秦<br />
穆公, 圍之, 往時食馬肉者, 相謂曰 : 「可以出死報食馬得酒之恩矣」<br />
遂潰圍. 穆公卒得以解難, 勝晉獲惠公以歸, 此德出而福反也. ) 23)<br />
6卷 「復恩」篇은 은혜를 베풀고 또 갚는 모든 일, 즉 은혜에 관<strong>한</strong><br />
얘기들<strong>이</strong> 소개되어 있다. 은혜라는 것은 베풀고 당장 자신에게 덕으<br />
로 돌아오기를 기대할 것<strong>이</strong> 아니다. 은혜를 베푼 자리에서 꼭 그 보<br />
답<strong>이</strong> 돌아오지 않으며 <strong>나</strong>에게 보답<strong>이</strong>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br />
<strong>나</strong> 내가 덕을 베푼 것을 기억치 못하고 있다 해도 내가 아닌 내 후<br />
대라도 復恩은 應答으로 돌아온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사람에게<br />
23) 上揭書 - 「6卷 復恩 10章」P. 219<br />
- 45 -
은혜를 베풀었다 하여도 당장 그 사람에게 보응을 받기를 바라지<br />
않는다. 하지만 은혜를 베푼 것은 어젠가는 꼭 보답으로 돌아온다.<br />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매우 강조되고 있다.<br />
7卷「政理」篇은 50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으며, ‘治國之道’에 대해 말하<br />
고 있다.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리는 것은 마치 거문고 줄을 당기듯 큰 줄을<br />
급하게 당겨 버리면 끊어지고 말듯 정치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정<br />
치란 마치 깜깜<strong>한</strong>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깜깜<strong>한</strong> 방에 들어가면 시<br />
간<strong>이</strong> 지난 후에야 물체를 알아볼 수 있듯<strong>이</strong> 처음부터 무턱대고 서<br />
둘러 일을 행하지 않기를 고사를 통해 권유하고 있다. 참된 정치는<br />
백성들<strong>이</strong> 부유하고 오래 사는 것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strong>이</strong> 참 治<br />
國의 모습<strong>이</strong>라 하겠다. 백성을 대함에 있어 자식을 사랑하듯<strong>이</strong> 또<br />
아우를 아끼듯<strong>이</strong> 하라고 말하고 있다.<br />
망할 <strong>나</strong>라는 창고만 가득가득 쌓<strong>이</strong>며 어진 임금은 공평하고 상줄<br />
때와 벌줄 때를 정확하게 아는 임금<strong>이</strong>다. 또 좌우 신하의 간사<strong>한</strong> 말<br />
을 멀리하고 놀고 먹는 사람<strong>이</strong> 녹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의 녹을<br />
빼앗아 훌륭<strong>한</strong> 선비를 모으는 일에 힘쓰는 것<strong>이</strong> 당연하다.<br />
백성은 무력<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법으로 다스리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며 먼저 모범<strong>이</strong> 되어<br />
교화시키도록 해야 <strong>한</strong>다.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 백성을 다룰 때<br />
는 조심해야 <strong>한</strong>다.<br />
매우 재미있게 주된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의 고사가 <strong>나</strong>란히 수록<br />
되어 있기도 하다. 7번째 章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도로써 인<br />
도해야 <strong>한</strong>다고 되어 있으<strong>나</strong> 8번째 章에는 백성<strong>이</strong>란 풀어놓았다가는<br />
잡을 수가 없으므로 모두 묶어 기르고 뜻을 따르도록 해야 <strong>한</strong>다고<br />
되어있다. 전체적인 내용<strong>이</strong> 교화<strong>나</strong>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내용의<br />
고사인데 비해 오직 8번째 章에서만 전체의 내용과 반대의 말을 하<br />
고 있다.<br />
- 46 -
왕도 정치의 흔적은 仁厚, 패도정치의 흔적은 武政으로 왕도정치<br />
쪽에 훨씬 큰 점수를 주고 있다.<br />
子貢<strong>이</strong> 孔子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묻자 공자가 <strong>이</strong>렇게 일<br />
러주었다. 「조심조심하여 썩은 고삐로 내닫는 말 다루듯 하려무<br />
<strong>나</strong>!」<strong>이</strong>에 자공은 다시 「어찌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까?」<br />
라고 하였다. 공자는 다시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br />
「사통팔달의 <strong>나</strong>라에는 가는 곳마다 사람<strong>이</strong> 있다. 그들을 道로써<br />
인도하면 모두가 <strong>나</strong>의 가축처럼 말을 잘 듣지만, 도로써 <strong>이</strong>들을<br />
인도하지 않으면 모두가 <strong>나</strong>의 원수<strong>나</strong> 마찬가지<strong>이</strong>다. 그러니 어찌<br />
두려워하지 않겠는가?」<br />
( 子貢問治民於孔子, 孔子曰 : 「懍懍焉, 如以腐索御奔馬.」 子貢曰<br />
: 「何其畏也!」 孔子曰 : 「夫通達之國, 皆人也, 以道導之, 則吾畜<br />
也 ; 不以道導之, 則吾讐也, 若何而毋畏?」) 24)<br />
<strong>이</strong>처럼 정치의 <strong>이</strong>치, 참된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愛民政治와<br />
王道政治를 권하는 글들<strong>이</strong> 계속적으로 보여지며 <strong>이</strong> 권에서 특히 강<br />
조되어 있다.<br />
8卷「尊賢」篇은 총 37章으로 현명함에 관<strong>한</strong> 고사들로 <strong>이</strong>루어졌<br />
다. 현명<strong>한</strong> 왕, 현명<strong>한</strong> 신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명<strong>한</strong> 왕은 어진<br />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strong>이</strong>다. 白里奚<strong>나</strong> 管中, 司馬喜 등도 모두 보잘<br />
것 없는 자들<strong>이</strong>었다. 그들<strong>이</strong> 현명<strong>한</strong> 군주를 만<strong>나</strong>지 못했다면 어쩌면<br />
거지로 죽었을 지도 모를 사람들<strong>이</strong>다. ‘小節을 보고 大禮를 안다’는<br />
말은 현명<strong>한</strong> 사람들끼리는 작은 것을 보고도 전부를 알 수 있다는<br />
말<strong>이</strong>다.<br />
24) 上揭書 - 「7卷 政理 8章」P.256<br />
- 47 -
매우 인의가 있거<strong>나</strong> 공정하지 않아도 천하를 얻었던 자들<strong>이</strong> 있다.<br />
훌륭<strong>한</strong> 사람을 등용하였기 때문<strong>이</strong>다. 어진 임금은 선비를 인정해<br />
주어야 하고 자신<strong>이</strong> 그보다 낮은 것을 표할 때 훌륭<strong>한</strong> 선비들을 등<br />
용할 수 있다.<br />
어진 사람을 알아보았다 하여도 등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등용<br />
하였더라도 간언을 실천하지 않는 다면 안 된다.<br />
어진 임금은 선비의 얘기를 듣고 실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예<br />
듣지도 않는 자가 아니다.<br />
훌륭<strong>한</strong> 선비를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은 <strong>나</strong>라의 큰 슬픔<strong>이</strong>며 그들의<br />
지혜를 사용하려면 합당<strong>한</strong> 대우가 있어야 <strong>한</strong>다.<br />
子路가 孔子에게 물었다.「<strong>나</strong>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br />
공자가 대답하였다.「어진 <strong>이</strong>를 존경하고, 불초<strong>한</strong> 자를 멀리하면<br />
된다.」자로가 다시 물었다.「笵氏ㆍ中行氏는 어진 <strong>이</strong>를 공경하고<br />
불초<strong>한</strong> 자를 멀리하였는데도 망했습니다. 그 <strong>이</strong>유는 무엇입니<br />
까?」<strong>이</strong>에 공자가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br />
「범씨 중항씨는 어진 <strong>이</strong>를 공경하되 <strong>이</strong>를 등용하지 않았고, 불<br />
초<strong>한</strong> 자를 멀리하되 아주 끊지를 못했느니라. 어진 <strong>이</strong>란 자신<strong>이</strong><br />
등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strong>나</strong>면 원망하는 법<strong>이</strong>요, 불초<strong>한</strong> 자는 자<br />
기를 천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strong>나</strong>면 원수로 여기는 법<strong>이</strong>다. 어진<br />
<strong>이</strong>가 원망을 갖고 불초<strong>한</strong> 자가 원수로 여기면, 원망과 원수가 함<br />
께 <strong>나</strong>란히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데, 중항씨가 비록 망하지 않<br />
으려고 버틴들 그것<strong>이</strong> 가능하겠느냐?」<br />
( 子路問於孔子曰 : 「治國何如?」 孔子曰 : 「在於尊賢而賤不<br />
肖.」 子路曰 : 「笵, 中行氏尊賢而賤不肖, 其亡, 何也?」 曰 :<br />
「笵, 中行氏尊賢而不能用也, 賤不肖而不能去也 ; 賢者, 知其不己用<br />
而怨之, 不肖者, 知其賤己而讎之. 賢者怨之, 不肖者讎之 ; 怨讎並前,<br />
中行氏雖欲無亡, 得乎?」) 25)<br />
- 48 -
예문에서 보여지듯 ‘현명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왕으로서의 현<br />
명함과 신하로서의 현명함을 말<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 예문은 임금<strong>이</strong> 어진 사람을<br />
알아보고 등용할 수 있는 현명함에 대하여 말하였다.<br />
9卷「正諫」篇 총26章은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올바른 간언의 모<br />
습을 보<strong>이</strong>고 있다. 소개된 대부분의 고사가 간언을 하는 자는 누구<br />
든지 죽<strong>이</strong>겠다고 말하는 왕 앞에 <strong>나</strong>가 간언<strong>한</strong> 사람들의 <strong>이</strong>야기<strong>이</strong>다.<br />
임금에게 과오가 있음에도 간언하지 않는 것은 임금<strong>이</strong> 망하는 것<br />
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strong>이</strong>다. 만약 3번<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누차 얘기를 하였음에도<br />
임금<strong>이</strong> 듣지 않는다면 떠<strong>나</strong>라고 말하고도 있다. 하지만 죽음까지 각<br />
오<strong>한</strong> 올바른 직언은 왕에게 받아들여질 테니 임금의 행동을 그치게<br />
할 수 있다.<br />
또 신하의 말을 듣고 잘못을 뉘우치고 멈출 수 있는 임금<strong>이</strong>라면<br />
겸손<strong>한</strong>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strong>이</strong>기에 그 덕 또<strong>한</strong> 후대에 칭송할<br />
만 <strong>한</strong> 것인 것<strong>이</strong>다.<br />
12章에서는 ‘군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소인에게는 아픔을<br />
알게 해주어야 <strong>한</strong>다’는 말<strong>이</strong> 있다. 다시 말해 <strong>이</strong>미 부끄러움을 알<br />
정도라면 군자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strong>이</strong>다.<br />
20章에서는 伍子胥의 계속되는 간언을 듣지 않고 도리어 伍子胥를<br />
죽<strong>이</strong>지만 그가 죽고 난 후 伍子胥의 말대로 된 것을 보고 자결하게<br />
된 夫差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고 있기도 하다.<br />
즉, 9卷에서는 간언을 하는 신하들의 모습과 함께 간언을 듣지 않<br />
았던 자의 최후를 보<strong>이</strong>고 있다. 하지만 諫言함<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권의 중심<strong>이</strong>기<br />
때문에 다음의 예문을 소개하려 <strong>한</strong>다.<br />
25) 上揭書 - 「8卷 尊賢 36章」P.356<br />
- 49 -
楚 莊王<strong>이</strong> 陽夏를 치면서 그 군사들<strong>이</strong> 오랫동안 시달렸지만 그<br />
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다. <strong>이</strong>에 여러 신하들<strong>이</strong> 간언을 하고자 하<br />
였으<strong>나</strong> 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왕<strong>이</strong> 아침<br />
雲夢에 사냥을 <strong>나</strong>갔을 때 椒擧가 <strong>나</strong>서서 <strong>이</strong>렇게 간언하였다.<br />
「왕께서 많은 짐승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말<strong>이</strong> 있기 때문입니다.<br />
그런데 왕의 <strong>나</strong>라가 망하고 <strong>나</strong>면 말을 어디서 구하지요?」<br />
<strong>이</strong> 말에 장왕은 「옳다! <strong>나</strong>(不穀)는 강<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라를 제압하면 제후<br />
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땅을 많<strong>이</strong> 가지<br />
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strong>나</strong> 우리 백성들<strong>이</strong><br />
옳게 쓰<strong>이</strong>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잊고 있었구<strong>나</strong>!」라고 하고는, <strong>이</strong><br />
튿날 대부들을 위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 자리에서 초거를 上<br />
客으로 삼아 양하의 전쟁을 그치게 하였다.<br />
( 楚莊王欲伐陽夏, 師久而不罷, 羣臣欲諫而莫敢, 莊王獵於雲夢, 椒<br />
擧進諫曰 : 「王所以多得獸者, 馬也 ; 而王國亡, 王之馬, 豈可得<br />
哉?」 莊王曰 : 「善, 不穀知詘彊國之可以長諸侯也, 知得地之可以<br />
爲富也 ; 而忘吾民之不用也.」 明日飮諸大夫酒, 以椒擧爲上客, 罷陽<br />
夏之師.) 26)<br />
9卷「正諫」篇은 劉向 자신<strong>이</strong> 가장 관심을 두고 집필<strong>한</strong> 부분<strong>이</strong>라<br />
사료된다. 그가 諫大夫를 지냈음은 <strong>이</strong>미 앞에서 말<strong>한</strong>바 있다.<br />
<strong>이</strong>처럼 죽음<strong>이</strong>라도 불사하는 直言에 대해 20여개의 고사를 통하여<br />
말하고 있다.<br />
10卷「敬愼」篇은 총 35章으로 매사에 경계하고 조심하는 모습<br />
또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들의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또 공경의 중<br />
요성을 말하고 있다. 성인은 매사에 경계하고 삼가는 모습을 가지고<br />
있다. 또 학문<strong>이</strong>라는 것은 빈 마음에 받아들<strong>이</strong>는 것<strong>이</strong>다. 오직 부드<br />
26) 上揭書 - 「9卷 正諫 7章」P.370<br />
- 50 -
러운 것만<strong>이</strong> 딱딱<strong>한</strong>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strong>이</strong>다. 쇠가 너무 딱딱하<br />
면 부러지고 가죽<strong>이</strong> 너무 딱딱하면 찢어지듯 왕<strong>이</strong> 너무 강하면 <strong>나</strong><br />
라가 망하고 신하가 너무 강하면 찾는 사람<strong>이</strong> 끊어진다. 늘 경계하<br />
고 조심해야 하는 <strong>이</strong>유는 존망화복의 근본<strong>이</strong>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br />
<strong>이</strong>다. 화라는 것은 복을 의지하여 생겨<strong>나</strong>고 복은 화 속에 감춰 있는<br />
것<strong>이</strong>다. 밤낮으로 근심하고 경계<strong>한</strong>다면 害를 피할 수 있다.<br />
망하는 길은 득의 만만하여 태만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기는 것<br />
<strong>이</strong>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가 10卷에 등장하는데 자식<strong>이</strong> 아무리 봉<br />
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몸을 세우고자 하<br />
는 자는 恭․敬․忠․信을 갖추어야<strong>한</strong>다.<br />
군자는 공경을 좋아하므로 그 <strong>이</strong>름을 <strong>이</strong>루고 소인은 공경을 배움<br />
으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은 그 행동을 새처럼 위 아래로<br />
매사 조심해야 함을 주로 말하고 있다.<br />
魏<strong>나</strong>라 公子인 牟가 동쪽 자기 <strong>나</strong>라로 가려 하자 穰候가 전송하<br />
면서 물었다.「선생께서 장차 저를 떠<strong>나</strong> 山東으로 가시려 합니다.<br />
어찌 저에게 <strong>한</strong> 말씀 좋은 가르침을 남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br />
까?」<strong>이</strong>에 공자 모가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그대가 일러 주지 않았더<br />
라면 제가 하마터면 잊을뻔했구료! 그대는 官運<strong>이</strong> 形勢와 아무런<br />
기약<strong>이</strong> 없는데도 그 勢가 저절로 찾아오는 경우를 아십니까? 또<br />
그 세가 富와 약속<strong>이</strong> 없었는데도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았지<br />
요? 그런가 하면 그 부가 貴와 약속하지도 않았음에도 교가 스스<br />
로 다가오는 것을 아시지요? 또 그 귀가 驕와 기약하지 않았음에<br />
도 교가 스스로 찾아오며, 그 교가 罪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strong>한</strong><br />
데 죄가 스스로 찾아들며, 죄가 죽음과 약속<strong>이</strong> 없는데도 죽음<strong>이</strong><br />
스스로 다가오는 것을 알겠지요?」<br />
<strong>이</strong>에 양후는 「좋습니다. 밝은 가르침을 공경히 받들겠습니다」<br />
라고 하였다.<br />
- 51 -
( 魏公子牟東行, 穰候送之曰 : 「先生將去冉之山東矣, 獨無一言, 以<br />
敎冉乎?」魏公子牟曰 : 「徵君言之, 牟幾忘語君, 君知夫官不與勢期,<br />
而富自至乎? 富不與貴期, 而貴自至乎? 貴不與驕期, 而驕自至乎? 驕<br />
不與罪期, 而罪自至乎? 罪不與死期, 而死自至乎?」 穰候曰 : 「善,<br />
敬受明敎.」) 27)<br />
<strong>이</strong>렇게 10卷「敬愼」篇은 예문에서도 보<strong>이</strong>듯 항상 경계하고 조심<br />
해야 <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성인<strong>이</strong> 가져야 할 자세<strong>이</strong>다. 항상 경계하고 조심<br />
하며 삼가야 할 대상은 자신임을 말하고 있다.<br />
11卷「善說」篇은 28章장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다. 행위가 선하지 못<strong>한</strong><br />
사람을 고쳐 주기란 참 쉽지 않다. 또 설득하려 해도 말을 해도 따<br />
라 주지 않는 것은 설득하는 그 언변<strong>이</strong>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논리가 명확<strong>한</strong>데도 그가 행동하지 않는 다면 그 <strong>이</strong>유는 논리의 견<br />
지가 굳세지 않았기 때문<strong>이</strong>고, 굳세게 밀고 <strong>나</strong>갔는데도 효과가 없다<br />
면 <strong>이</strong>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善을 격동시키지 못하였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논리에 맞고 명확하며 지속적<strong>이</strong>고 견고하게 하면서 또<strong>한</strong> 그의 마<br />
음속 善까지 적중시켜, 그 언어가 신기하고 진기하며 밝고 분명하여<br />
마음속을 움직<strong>이</strong>듯 설득력을 가졌으면서도 실행을 얻지 못하는 경<br />
우란 보기가 힘들다. <strong>이</strong>렇게 윗사람에겐 부드럽게 풀어주는 말투 그<br />
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안정시키는 말<strong>이</strong>다. 다시 말해 논리가 명확하<br />
여 마음을 움직<strong>이</strong>는 연설<strong>이</strong>라 말할 수 있겠다.<br />
어떤 사람<strong>이</strong> 梁王에게 <strong>이</strong>렇게 일러 주었다.<br />
「惠子는 어떤 사건을 설명하면서 비유를 잘 듭니다. 왕께서 그에<br />
게 비유법을 쓰지 말라고 하면 그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br />
왕은 <strong>이</strong>에 「알았다」하고 다음날 혜자를 만났다.<br />
27) 上揭書 - 「10卷 敬愼 19章」P.436<br />
- 52 -
「원컨데 선생께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시고 비유는 들지 말아 주십<br />
시오!」그러자 혜자가 물었다.「지금 여기에 彈<strong>이</strong> 무엇인지 모르는<br />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탄<strong>이</strong>란 어떻게 생긴 물건<strong>이</strong>냐』고 물<br />
어왔을 때 『탄의 모양은 탄처럼 생겼지』라고 <strong>한</strong>다면 그가 알아<br />
듣겠습니까?」왕<strong>이</strong>「못 알아듣지요」라고 하자, 혜자가 말을 계속<br />
하였다.「그러면『탄의 모양은 활 같고 대<strong>나</strong>무로 弦을 만들었다』<br />
고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그러면 알아듣지요!」<br />
<strong>이</strong>에 혜자는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무릇 설명<strong>이</strong>란, 상대가 <strong>이</strong>미 알<br />
고 있는 것을 <strong>이</strong>용해서 그 모르는 바를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br />
래야 그 사람<strong>이</strong>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비유를 들지<br />
말라고 하사니, <strong>이</strong>는 불가능<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입니다.」<br />
왕은 <strong>이</strong>에「옳다」라고 하였다<br />
( 客謂梁王曰 : 「惠子之言事也, 善譬, 王使無譬, 則不能言矣.」<br />
王曰 : 「諾, 明日見, 謂惠子曰 : 願先王言事, 則直言耳. 無譬也.」<br />
惠子曰 : 「今有人於此, 而不知彈者, 曰 : 『彈之狀何若?』 應曰 :<br />
『彈之狀如彈.』 則諭乎?」 王曰 : 「未諭也.」「於是更應曰 : 『彈<br />
之狀如弓, 而以竹爲弦.』 則知乎?」 王曰 : 「可知矣.」 惠子曰 :<br />
「夫設者, 固以其所知, 諭其所不知, 而使人知之. 今王曰無譬則不可<br />
矣.」 王曰 : 「善」) 28)<br />
<strong>이</strong>처럼 사람을 설득시키거<strong>나</strong> 사람을 <strong>이</strong>해시키는 말은 중심에 善을<br />
가지고 있어야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strong>이</strong>다.<br />
12卷「奉使」篇은 21章으로 명령을 받아 임무에 충실히 하는 사<br />
람들의 고사가 대부분인데 즉 <strong>나</strong>라를 존속시키는 충신의 모습을 주<br />
로 보<strong>이</strong>고 있다.<br />
28) 上揭書 - 「11卷 善說 8章」P.468<br />
- 53 -
晉 ․楚 두 <strong>나</strong>라 임금<strong>이</strong> 서로 친하여 宛丘에서 회연을 갖게 되<br />
었다. 송宋<strong>나</strong>라는 <strong>이</strong>에 사람을 보내어 가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strong>이</strong><br />
때 진 ․초의 대부들<strong>이</strong> 송<strong>나</strong>라 사신에게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공손<br />
하게 천자天子를 뵙는 예로 <strong>한</strong>다면, 내가 그대를 우리들의 임금에<br />
게 안내하여 만<strong>나</strong> 볼 수 있게 하리라.」그러자 송<strong>나</strong>라 사신<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br />
렇게 대꾸하였다.「冠은 아무리 낡았어도 위에 쓰는 것<strong>이</strong>요, 신은<br />
아무리 새것<strong>이</strong>라도 아래에 신는 것<strong>이</strong>요! 周室<strong>이</strong> 비록 쇠미해졌다<br />
하<strong>나</strong> 諸侯가 <strong>이</strong>를 대신할 수 없고, 군대를 몰아 우리 송<strong>나</strong>라를 쳐<br />
들어온다 해도 <strong>나</strong>는 복장을 바꾸지 못 할 것입니다.」그리고는 揖<br />
을 하고 떠<strong>나</strong> 버렸다. 여러 대부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며,<br />
드디어 제후를 뵙는 예로써 그를 자신들의 임금에게 안내하였다.<br />
( 晉楚之君, 相與爲好, 會於宛丘之上. 宋使人往之. 晉楚大夫曰 :<br />
「趣以見天子禮見於吾君, 我爲見子焉.」 使子曰 : 「冠雖敝, 宜加其<br />
上 層雖新, 宜居其下 周室雖微, 諸侯未之能易也. 師升宋城, 臣猶不<br />
更臣之服也」揖而去之, 諸大夫瞿然, 遂以諸侯之禮見之. ) 29)<br />
≪說苑≫에서 항상 보<strong>이</strong>는 바에 의하면 왕과 신하로서의 자세와<br />
그 해야할 일까지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br />
12卷「奉使」篇은 2卷「臣述」篇보다 더욱 엄격<strong>한</strong> 신하의 모습을<br />
강조하고 있다. 왕을 받드는 忠臣의 모습<strong>이</strong> 중심 되는 고사<strong>이</strong>다.<br />
13卷「權謀」篇은 48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 졌으며, <strong>나</strong>라의 상황에 맞게<br />
모책을 내놓는 신하들의 고사<strong>이</strong>다. <strong>한</strong>편으로 「正諫」篇의 고사들과<br />
많<strong>이</strong>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strong>나</strong> 주로 전쟁 같은 위기상황 바른<br />
말<strong>이</strong>니 諫言보다는 謀策<strong>이</strong>라 하는 것<strong>이</strong> 더 맞겠다.<br />
楚 莊王<strong>이</strong> 陳<strong>나</strong>라를 치려고 사람을 시켜서 정세를 살피고 오도<br />
29) 上揭書 - 「12卷 奉使 10章」P.521<br />
- 54 -
록 하였다. 심부름하는 사람<strong>이</strong> 돌아와 <strong>이</strong>렇게 보고하였다.<br />
「진<strong>나</strong>라는 칠 수 없습니다.」 장왕<strong>이</strong> 「무슨 <strong>이</strong>유냐?」고 묻자,<br />
그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 「그 <strong>나</strong>라는 성곽<strong>이</strong> 높고 溝壑<strong>이</strong> 깊으며,<br />
쌓아둔 양식 또<strong>한</strong> 많아 <strong>나</strong>라가 편안합니다.」<br />
그러자 장왕은 <strong>이</strong>렇게 판단하였다.「진<strong>나</strong>라는 쳐도 된다. 무릇 진<br />
<strong>나</strong>라는 작은 <strong>나</strong>라<strong>이</strong>면서 쌓아 놓은 것<strong>이</strong> 많다. 많<strong>이</strong> 쌓<strong>이</strong>고 모으<br />
려면 세금<strong>이</strong> 무거웠을 것<strong>이</strong>다. 세금<strong>이</strong> 무거우면 백성들<strong>이</strong> 윗사람<br />
을 원망하기 마련<strong>이</strong>다. 또 성곽<strong>이</strong> 높고 그 둘레를 판 溝壑<strong>이</strong> 깊다<br />
면, <strong>이</strong>는 백성<strong>이</strong> 지쳤다는 뜻<strong>이</strong>다.」<br />
그리고는 군대를 일으켜 쳐서 드디어 진<strong>나</strong>라를 취하였다.<br />
( 楚莊王欲伐陳, 使人視之, 使者曰 : 「陳不可伐也.」 莊王曰 :<br />
「何故?」對曰 : 「其城郭高, 溝壑深, 蓄積多, 其國寧也.」王曰 :<br />
「陳可伐也. 夫陳, 小國也, 而蓄積多, 蓄積多則賦斂重, 賦斂重則民<br />
愿上矣. 城郭高, 溝壑深, 則民力矣.」 興兵伐之, 遂取陳. ) 30)<br />
13卷에서도 마찬가지로 신하로서 두려워 말고 諫言할 것을 권하고<br />
있다. 따라서 고사가 내용적으로 많<strong>이</strong> 중복된다. <strong>이</strong>는 ≪說苑≫을<br />
통하여 劉向<strong>이</strong>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br />
14卷「至公」篇은 22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으며, 어떤 현명<strong>한</strong> 사람들의<br />
<strong>이</strong>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70餘 개의 <strong>나</strong>라를 돌아다니면서도 받<br />
아 들여주는 곳<strong>이</strong> 없던 孔子의 신세를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다. 아<br />
마도 <strong>이</strong>것은 劉向<strong>이</strong> 살아서는 다른 사상가들보다 조금 남루<strong>한</strong> 모습<br />
으로 살았지만 후세에 칭송을 받은 孔子의 사상을 매우 안타깝게<br />
여겼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br />
孔子는 亂世에 태어<strong>나</strong>서 천하가 그를 용납하지 못하였다. 그래<br />
30) 上揭書 - 「13卷 權謀 18章」P.558<br />
- 55 -
서 임금들에게 그 말씀을 행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게 <strong>한</strong> 후에<br />
야 벼슬을 하였다. 그러<strong>나</strong> 말<strong>이</strong> 임금에게 먹혀들지 않고, 그 혜택<br />
<strong>이</strong>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물러났다. 공자는 천하를 다<br />
덮어 줄 마음과 仁聖의 덕을 끼고 時俗의 더러움을 불쌍히 여기<br />
며, 紀綱<strong>이</strong> 허물어짐을 상심하면서 무거운 짐에 먼길을 달려 천하<br />
의 초빙에 응하러 다녔다. <strong>이</strong>는 곧 그<strong>나</strong>마 백성을 자식같<strong>이</strong> 여기<br />
며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strong>이</strong>었다. 그러<strong>나</strong> 역시 당<br />
시의 제후들은 능히 그를 임용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덕을 쌓을<br />
수록 겸손히 하였던 것<strong>이</strong>다. 때문에 大道가 굽혀진 채 펴지지 못<br />
하였고, 온 세상은 그 교화를 입지 못하였으며, 羣生은 그 은혜를<br />
입지 못하였다.<br />
<strong>이</strong>에 공자는 탄식하여 「<strong>나</strong>를 등용해 주는 자가 있기만 하다면,<br />
내 저 周<strong>나</strong>라의 훌륭<strong>한</strong> 정치를 <strong>이</strong> 동쪽에서 실현해 보련만!」 <strong>이</strong><br />
라고 하였다. <strong>이</strong>를 보면 공자가 다니며 유세<strong>한</strong> 것은 자기 자신을<br />
위<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아니며, 작은 <strong>한</strong> 성城으로부터 德治를 운용하여 천하가<br />
편안해지며, 그로 인해 그 은혜가 만백성에게 세워지기를 원했지<br />
때문<strong>이</strong>었음을 알 수 있다.<br />
( 孔子生於亂世, 莫之能容也. 故言行於君, 澤加於民, 然後仕. 言不<br />
行於君, 澤不加於民則處. 孔子懷天覆之心, 挾仁聖之德, 憫時俗之汙<br />
泥, 傷紀綱之廢壞, 服重歷遠, 周流應聘, 乃俟幸施道以子百姓, 而當<br />
世諸侯漠能任用, 是以德積而不肆, 大道屈而不伸, 海內不蒙其化, 羣<br />
生不被其恩, 故喟然而歎曰: 「而有用我者, 則吾其爲東周乎!」 故孔<br />
子行說, 非欲私身, 運德於以一城, 將欲舒之於天下, 而建之於羣生者<br />
耳. ) 31)<br />
<strong>이</strong> 卷에서는 유독 孔子에 대<strong>한</strong> 고사가 많<strong>이</strong> 소개되는데 先術하였<br />
듯 劉向<strong>이</strong> 공자가 생전에 널리 쓰임 받지 못함을 안타까워 <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유<br />
로 사료된다. 또<strong>한</strong> 유학은 당시의 학자들에게 성현으로 여겨졌다.<br />
31) 上揭書 - 「14卷 至公 10章」P.610<br />
- 56 -
공자에 대<strong>한</strong> 고사가 많은 것은 당연<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br />
15卷「指武」篇은 28章으로 <strong>이</strong>루어졌으며 싸움에 대<strong>한</strong> 정의를 <strong>나</strong><br />
타내다. <strong>나</strong>라가 강대하지만 싸움을 좋아하면 반드시 망하기 마련<strong>이</strong><br />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력<strong>이</strong>란 즐길 수 있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며 어<br />
진 왕은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릴 때 무력을 즐겨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br />
司馬法에 <strong>이</strong>렇게 실려 있다.『<strong>나</strong>라가 비록 강대하<strong>나</strong> 싸움을 좋<br />
아하면 반드시 망하게 마련<strong>이</strong>며, 천하가 비록 편안하<strong>나</strong> 전쟁을 잊<br />
고 살면 반드시 위험<strong>한</strong> 경우를 당<strong>한</strong>다.』또 易에는 『군자는 무기<br />
를 정비하여 뜻밖의 사변을 경계<strong>한</strong>다』 라고 하였다. 무릇 무력<strong>이</strong><br />
란 즐길 수 있는 일<strong>이</strong> 아니다. <strong>이</strong>를 자주 즐기면 위엄<strong>이</strong> 없어진다.<br />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다. 없애면 적<strong>이</strong> 쳐들어오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옛날 吳王 夫差는 싸움을 좋아하다가 망하였고, 徐 偃王은 군대<br />
를 없앴다가 멸망하였다. 따라서 어진 왕<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림에는 위<br />
에서는 무력을 즐겨서는 안 되고, 아래에서는 무력을 폐기해서는<br />
안 된다. 易에는 『편안할 때에 危亡을 잊지 말라』 고 하였다. 그<br />
래야 자신도 안전하고 국가도 보전할 수 있다.<br />
(司馬法曰 : 『國雖大, 好戰必亡 ; 天下雖安, 忘戰必危.』 易曰:<br />
『君子以除戎器, 戒不虞.』 夫兵不可玩, 玩則無威 ; 兵不可廢, 廢則<br />
召寇, 昔吳王夫差好戰而亡, 徐偃王無武亦滅, 故明王之濟國也. 上不<br />
玩兵, 不不廢武. 易曰 : 『存不忘亡.』是以身安而國可保也.) 32)<br />
<strong>이</strong> 篇에서는 싸움, 즉 전쟁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임금<strong>이</strong> 전쟁을<br />
좋아하면 <strong>나</strong>라가 망하게 된다. 그러<strong>나</strong> 아예 전쟁을 모르고 살아도<br />
<strong>나</strong>라를 지킬 수 없다. 전쟁을 좋아하고 즐겨서는 안되지만 항상 전<br />
쟁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strong>한</strong>다고 말하고 있는데 약간의<br />
32) 上揭書 - 「15卷 指武 1章」P.629<br />
- 57 -
아<strong>이</strong>러니를 느끼게 하는 부분<strong>이</strong>다.<br />
16卷「談叢」篇은 209章 딱히 주제를 얘기하기가 어렵다. 속담처<br />
럼 보<strong>이</strong>는 두 줄 미만의 짧은 문장들<strong>이</strong> 200개 정도가 되고 권고하<br />
는 대상도 왕, 선비에서부터 여인들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br />
<strong>이</strong> 부분<strong>이</strong>야말로 속담<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격언을 모아놓은 ‘格言集’<strong>이</strong>라 말해도 될<br />
것<strong>이</strong>다.<br />
화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데에서 생기고, 복은 스스로 그치는<br />
데에서 생겨난다. (禍生於欲得, 福生於自禁). 33)<br />
성인은 마음으로 감지하여 귀와 눈을 인도하고, 소인은 귀와 눈<br />
으로 익혀 마음으로 전달<strong>한</strong>다.(聖人以心導耳目, 小人以耳目導心). 34)<br />
남의 윗자리가 된 자는 총명하지 못할까에 근심을 두고, 남의 아<br />
래된 자는 자신<strong>이</strong> 충성되지 못할까에 근심을 두라. (爲人上者, 患<br />
在不明; 爲人下者, 患在不忠.) 35)<br />
광대<strong>한</strong> 것은 화합을 좋아하는데 있고, 공경은 어버<strong>이</strong>를 섬기는<br />
데에 있다. (廣大在好利, 恭敬在事親). 36)<br />
때를 잘 순응하면 仁을 쉽게 행할 수 있고, 도를 잘 순응하면 사<br />
람을 쉽게 통달시킬 수 있다. (因時易以爲仁, 因道易以達人.) 37)<br />
<strong>이</strong>익에 매달려 급급하면 환난을 만<strong>나</strong>기 쉽고, 가볍고 경솔하게<br />
33) 上揭書 - 「16卷 談叢 131章」P.696<br />
34) 上揭書 - 「16卷 談叢 132章」P.696<br />
35) 上揭書 - 「16卷 談叢 133章」P.696<br />
36) 上揭書 - 「16卷 談叢 136章」P.697<br />
37) 上揭書 - 「16卷 談叢 137章」P.697<br />
- 58 -
응낙을 하게 되면 믿음<strong>이</strong> 줄어들게 된다. (營於利者多患, 輕 者寡<br />
信.) 38)<br />
<strong>이</strong>는 ≪說苑≫ 가운데 가장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strong>이</strong>라<br />
할 수 있다. 권고하는 대상도 매우 다양하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지<br />
만 충고하고 권하는 내용임엔 틀림<strong>이</strong> 없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권의 중심 되<br />
는 내용<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다.<br />
17卷「雜言」篇은 56章으로 ≪說苑≫원에서 각 편 주제에 맞도<br />
록 정리된 고사들 <strong>이</strong>외에 ≪說苑≫에 꼭 싣고 싶지만 마땅히 주제<br />
를 정하지 못<strong>한</strong> 고사들을 모아놓은 것<strong>이</strong> 아닌가 하는 느낌<strong>이</strong> 들 정<br />
도로 주제가 다양하다. 임금의 얘기<strong>나</strong> 孔子와 弟子들의 말도 등장하<br />
며 등장인물 또<strong>한</strong>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주로 孔子 一人<strong>이</strong> 말<strong>한</strong> 것<br />
<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篇에 집중되어 있다.<br />
仲尼가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그 땅<strong>이</strong> 아닌 곳에는 심어 보았자<br />
자라 수가 없으며, 그 사람<strong>이</strong> 아니면 말을 해주어 보았자 듣지를<br />
않는다. 말을 들을 사람을 얻으면 마치 모래를 쌓아 둔 곳에 비가<br />
내리듯<strong>이</strong> 술술 적셔들지만, 그 사람<strong>이</strong> 아닌 경우에는 귀먹은 <strong>이</strong>를<br />
모아두고 북을 치는 것과 같다.」<br />
( 仲尼曰: 「非其他, 而樹之, 不生也, 非其人, 而語之, 弗聽也; 得<br />
其人, 如 沙而雨之, 非其人, 如聚聾而鼓之. ) 39)<br />
孔子가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배는 물을 만<strong>나</strong>지 못하면 운행할 수<br />
없으<strong>나</strong>, 그 물<strong>이</strong> 배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침몰하고 만다. 그래<br />
38) 上揭書 - 「16卷 談叢 138章」P.697<br />
39) 上揭書 - 「17卷 雜言 42章」P.768<br />
- 59 -
서 『군자는 근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소인은 방비하지 않<br />
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 孔子曰: 「船非水不可行, 水入船中, 則其沒也, 故曰: 『君子不可<br />
不嚴也, 小人不可不哉也.』) 40)<br />
17卷에서는 특별히 예문을 2개를 두었다. 그 <strong>이</strong>유는 화자는 모두<br />
공자지만 두 예문은 주제가 상당 부분 틀리다. <strong>이</strong>처럼 17卷에서 소<br />
개된 고사들은 주제를 하<strong>나</strong>로 모으기는 어렵지만 여러 귀감<strong>이</strong> 되는<br />
고사들<strong>이</strong> 모여 있다.<br />
18卷 「辨物」篇은 32章으로 ≪說苑≫가운데 가장 흥미진진<strong>한</strong><br />
부분<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 18卷에서는 그간 좀처럼 볼 수 없던 志怪고사들<br />
도 몇 가지 소개되고 있다. 그러<strong>나</strong> 그 역시 사람<strong>이</strong> 주인공<strong>이</strong>며 神怪<br />
를 주인공으로 <strong>한</strong> 고사는 없다. 마치 중세 그리스 철학처럼 어떤 사<br />
물에 대<strong>한</strong> 철학과 변증<strong>이</strong> 담겨 있다.<br />
哀公<strong>이</strong> 활을 쏘다가 그 화살<strong>이</strong> 穀神의 신위를 맞히고 말았다.<br />
그러자 애공은 입에 병<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다. <strong>이</strong>에<br />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巫官에게 점을 쳐서 빌도록 하였다.<br />
무관<strong>이</strong> 말을 바꾸어 <strong>이</strong>렇게 일러 주었다.<br />
「곡신<strong>이</strong> 다섯 가지 곡식을 지고 그루터기에 의지해 하늘로부터<br />
내려오다가 땅에 닿기도 전에 그 <strong>나</strong>무가 부러졌습니다. <strong>이</strong>때<br />
獵谷에 살던 <strong>한</strong> 노인<strong>이</strong> 얼른 옷을 벌려 그 곡식을 받아내<br />
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노인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br />
있겠습니까?」애공<strong>이</strong> 그 말대로 하자 입병<strong>이</strong> 사라지고 말았다.<br />
( 哀公射而中稷, 其口疾不肉食, 祠稷而善卜之巫官, 巫官變曰: 「稷<br />
貢五種, 託株而徒天下, 未至于地而株絶, 獵谷之老人張衽以受之, 何<br />
40) 上揭書 - 「17卷 雜言 43章」P.768<br />
- 60 -
不告祀之?」 公徒之, 而疾去. ) 41)<br />
18卷은 「辨物」편은 어떤 사물과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br />
說苑≫의 다른 어느 편보다 妖怪와 神의 등장<strong>이</strong> 많다. <strong>이</strong>것은 18卷<br />
에 天人感應論에 따라 판단<strong>한</strong> 사건과 사물에 대<strong>한</strong> 고사들<strong>이</strong> 대거<br />
등장하기 때문<strong>이</strong>다. 위에 보<strong>이</strong>는 예문에서도 곡신에게 제사하여 입<br />
병<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은 애공의 고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strong>이</strong>처럼 사람과 하늘은<br />
늘 관계하고 있다. 또<strong>한</strong> 상서롭지 못<strong>한</strong> 물건에 대하여도 <strong>이</strong>미 앞으<br />
로의 결정 난 것<strong>이</strong>라 생각할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임금과 社稷<strong>이</strong> 몸을 닦고<br />
바른 정치를 위해 노력할 때 상서롭지 못<strong>한</strong> 물건은 사라진다. 하늘<br />
은 위기를 주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것<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 편에서는 祥瑞에 災異에 대하여 왕들<strong>이</strong> 대처해 <strong>나</strong>간 모양을 보<br />
<strong>이</strong>고 있다.<br />
19卷「修文」篇은 총 44章으로 혼례부터 장례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모<br />
든 일을 행할 때에 仁義를 기준으로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풍속을<br />
바꾸는데 악보다 더 좋은 것<strong>이</strong> 없고 위를 편안히 하고 백성을 잘<br />
다스리는데는 예보다 좋은 것<strong>이</strong> 없다. 라는 말<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온다. 왕에게 요<br />
구되는 인과 의뿐만 아니라 백성들 중 여인들에게까지 매우 다양<strong>한</strong><br />
분야에 대해 얘기 하고있다. <strong>이</strong> 편은 다른 편들에 비해 篇幅도 거의<br />
일정<strong>한</strong> 편<strong>이</strong>며 옛 책<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성현의 말들 중 문장<strong>이</strong> 간결하고 수려<strong>한</strong><br />
것을 뽑아온 듯 하다.<br />
書에 五事를 말하면서 그 째로 貌를 들었다.<br />
貌라는 것은 남자로서 갖추어야 할 恭敬의 얼굴빛과, 부인으로서<br />
갖추어야 할 交好를 말<strong>한</strong>다. 걷는 태도도 격식에 맞아야 하고, 돌<br />
41) 上揭書 - 「18卷 辨物 27章」P.824<br />
- 61 -
아서거<strong>나</strong> 움직임도 격식에 맞아야 <strong>한</strong>다. 설 때는 磬折해야 하고,<br />
인사할 때는 抱鼓의 모습<strong>이</strong>어야 <strong>한</strong>다. 임금에게 조회하러 <strong>나</strong>아갈<br />
때에는 尊嚴하게 하며, 宗廟에 들어갈 때는 敬忠해야 하고, 鄕黨에<br />
들어갈 때는 和順해야 하며, 자신의 族黨<strong>이</strong> 있는 州里에 들어갈<br />
때는 和親해야 <strong>한</strong>다. 詩에 「온화하고 공손하게 남을 대하는 것,<br />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곧 덕의 기본일세!」라고 하였고, 孔子는 「공경스럽게 하<br />
여 예에 가까<strong>이</strong>하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br />
( 書曰五事: 一曰貌. 貌若男子之所以恭敬, 婦人之所以姣好也. 行步<br />
中矩, 折旋中規, 立則磬折, 拱則抱鼓, 其以入君朝, 尊以嚴, 其以入宗<br />
廟, 敬以忠, 其以入鄕黨, 和以入州里族黨之中, 和以親, 詩曰: 『溫溫<br />
恭人, 惟德之基.』 孔子曰: 『恭近於禮, 遠恥辱也.』) 42)<br />
19卷은「修文」<strong>이</strong>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백성들의 교화할 수 있<br />
는 잘 닦인 문장들<strong>이</strong>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에 하<strong>나</strong>씩 짧막하게<br />
읽을 수 있는 黙想集과 같은 형태라 할 수 있는데 의복에 대<strong>한</strong> 禮<br />
부터 제사에 대<strong>한</strong> 禮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매우 다양<strong>한</strong> 분야에 대해 <strong>이</strong>야<br />
기하고 있다. <strong>이</strong>것은 모든 일을 행하든 인의에 드러내는 예를 행하<br />
게 하려 하는 의도가 보인다 할 수 있겠다.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중<br />
복되는 내용의 고사를 통해 禮를 강조하고 있다.<br />
20卷「反質」篇은 25章으로 되어있으며 그동안 알고 있던 사물에<br />
대<strong>한</strong> 시각을 반대로 뒤엎어 보여주기도 <strong>한</strong>다. 보<strong>이</strong>는 데로가 아닌<br />
사물의 본질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간 길<strong>한</strong> 점괘로<br />
알고 있던 점괘를 보고 탄식하는 孔子에게 弟子들<strong>이</strong> 그 <strong>이</strong>유를 묻<br />
자 ‘본래의 빛깔<strong>이</strong> 아니기 때문<strong>이</strong>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strong>이</strong><br />
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배제하고 본래의 모습만 보기를 권하고 있는<br />
듯 하다.<br />
42) 上揭書 - 「19卷 修文 7章」P.840<br />
- 62 -
晉 文公<strong>이</strong> 제후들을 모아 會盟을 하면서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br />
「내가 듣기로 <strong>나</strong>라가 昏迷에 빠지는 것은, 聲色<strong>이</strong> 아니면 반드시<br />
姦利에 말미암는다고 하였습니다. 성색을 탐미하면 淫佚하게 되고,<br />
간리에 탐욕<strong>이</strong> 생기면 미혹迷惑하게 됩니다. 무릇 음일<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미혹<br />
에 빠진 <strong>나</strong>라는 망하지 않으면 반드시 잔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br />
러니 지금부터 예쁜 첩으로 인해 본처를 의심하는 일, 음악으로<br />
인해 정의에 방해를 받는 일, 간악<strong>한</strong> 情理에 얽매여 公事를 그르<br />
치는 일, 재물로 인해 남을 멸시하는 일<strong>이</strong> 없도록 해야 합니다.<br />
그러<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 있는 것을 『뿌리를 자르면서 잎<strong>이</strong> 화려하기를 바란<br />
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 있는 <strong>나</strong>라라면 환난<strong>이</strong><br />
생겨도 우리는 근심해 주지 않을 것<strong>이</strong>요, 도적<strong>이</strong> 쳐들어와도 막아<br />
주지 않을 것입니다. <strong>이</strong> 말대로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맹약에 따<br />
라 실행하여 보여 줄 것입니다.」<br />
<strong>이</strong>에 군자가 <strong>이</strong> 소식을 듣고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문공은 도를 아<br />
는 분<strong>이</strong>로다. 그가 왕자까지 되지 못하였다면 천하는 바로 도와<br />
줄 자가 없었으리라!」<br />
( 晉文公合諸候而盟曰: 「吾問國之昏, 不由姦利好樂, 聲色者, 淫也;<br />
貪姦者, 惑也, 夫淫感之國, 不亡必殘, 自今以來, 無以美姜疑妻, 無以<br />
聲樂妨正, 無以姦情害公, 無以貨利示下, 其有之者, 是謂『仗其根索,<br />
流於華葉.』若此者, 有冠勿. 不如言者盟示之.」 於是君子聞之曰:<br />
「文公其知道乎! 其不王者, 猶無佐也.」) 43)<br />
20卷「反質」篇은 우리 머리 속에서 어떤 코드化 되어버린 것에<br />
대하여서도 본래 그대로를 보게끔 하고 있다.<br />
<strong>이</strong>렇게 ≪說苑≫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인간<br />
43) 上揭書 - 「20卷 反質 18章」P.918<br />
- 63 -
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에 대<strong>한</strong> 정보 전달 차원의 <strong>이</strong>야기와<br />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감응에 관<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로 집약할 수<br />
있다.<br />
단순<strong>한</strong> 정보전달에서 그친 것도 개중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인간을<br />
둘러싸고 여러 환경 가운데에서 대처 방법<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유용<strong>한</strong> 지식과 정보<br />
가 되는 의미 있는 지식<strong>이</strong> 되고 있다.<br />
또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교훈을 주는 것들은 구체적인 <strong>이</strong>야기 <strong>한</strong>편<br />
을 통해 인간<strong>이</strong>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 <strong>이</strong>야기를 하고 있다.<br />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고사들은 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소설적인 <strong>이</strong>야기 거리<br />
를 갖추고 있어 문학성도 매우 뛰어<strong>나</strong>다 할 수 있겠다.<br />
第3節. ≪說苑≫의 思想的 分析<br />
(1). 儒敎的 性格<br />
≪說苑≫은 劉向<strong>이</strong> 유교의 정치 <strong>이</strong>념과 정치 사상을 천명하기<br />
위하여 저술<strong>한</strong> 것으로 20卷의 각기 다른 제목으로 <strong>이</strong>뤄졌다 하여도<br />
내용<strong>이</strong> 계속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br />
임금에겐 백성을 仁과 愛로 다스리는 愛民 사상을 얘기하고 백성<br />
에겐 孝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br />
또<strong>한</strong> 前漢時期의 대유학자<strong>이</strong>며 劉向의 스승으로 유향에게 있어 많<br />
은 영향을 끼친 董仲舒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strong>한</strong>다. 유교적인<br />
정치 <strong>이</strong>념과 더불어 ≪說苑≫을 <strong>이</strong>루는 기본적 사상<strong>이</strong> 되고 있는<br />
동중서의 天人感應論에 대해 알아봄은 마땅하다 생각된다.<br />
- 64 -
河間獻王<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br />
1) 仁愛․忠孝<br />
「요임금은 천하에 마음을 바로 두고 가난<strong>한</strong> 백성을 보살피는 데에<br />
그 뜻을 쏟았다. 많은 백성들<strong>이</strong> 죄에 걸려들게 됨을 애통해했으며,<br />
또 그 중생<strong>이</strong> 자기 삶을 성취시키지 못함을 근심했다. 그래서 하<strong>나</strong><br />
의 백성<strong>이</strong>라도 굶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strong>이</strong>는 자신 대문에 굶는<br />
것<strong>이</strong>라 여겼으며, 누구 하<strong>나</strong> 헐벗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또<strong>한</strong> 자<br />
신 때문에 헐벗었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 <strong>한</strong> 백성<strong>이</strong> 죄를 지<br />
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도 역시 자신<strong>이</strong> 그를 죄에 빠지게 하였다고<br />
여겼다. <strong>이</strong>처럼 仁義가 밝히 세워지고 덕화가 널리 베풀어지자 상을<br />
주지 않아도 백성은 부지런해졌으며 벌을 내리지 않아도 잘 다스려<br />
지게된 것<strong>이</strong>다. 먼저 용서하고 뒤에 가르치는 것<strong>이</strong> 요임금의 治道였<br />
다. 또 순임금 때에 유묘씨가 복종하지 않았는데, 그들<strong>이</strong> 복종하지<br />
않은 <strong>이</strong>유는, 그 남쪽은 태산, 그 북쪽은 전산, 그리고 왼쪽은 동정<br />
의 파도, <strong>이</strong>런 <strong>이</strong>유로 불복하자 우가 <strong>이</strong>를 토벌하자고 했을 때 순은<br />
<strong>이</strong>렇게 반대하였다. 「그들을 교화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을 아직 끝<br />
까지 해보지 않았다. 끝까지 그들을 가르쳐야 <strong>한</strong>다.」<br />
뒤에 과연 유묘씨가 복종을 청해 오자 천하 사람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소식을 들<br />
고 모두가 우의 잘못을 말하면서 순임금<strong>이</strong>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켰<br />
다고 칭송했다.」<br />
( 河間獻王曰 : 「堯存心於天下, 加志於窮民, 痛萬姓之罹罪, 憂衆生之<br />
不遂也. 有一民飢, 則曰此我飢之也 ; 有一人寒, 則曰此我寒之也 : 一<br />
民有罪, 則曰此我陷之也. 仁昭而義立, 德博而化廣; 故不賞而民勤 不罰<br />
而民治. 先怒而後敎, 是堯道也. 當舜之時, 有苗氏不服, 其所以不服者,<br />
大山在其南, 殿山在其北 ; 在洞庭之波, 右彭蠡之川 ; 因此險也, 所以<br />
不服 禹欲代之, 舜不許, 曰 : 『諭敎猶未竭也, 然諭敎焉.』而有苗氏請<br />
服, 天下聞之, 皆非禹之義 , 而歸舜之德」) 44)<br />
- 65 -
유교 정치<strong>이</strong>념의 가장 기본<strong>이</strong>라 말 할 수 있는 <strong>이</strong> 仁愛는 특히 왕<br />
에게 더욱 요구되는 덕목<strong>이</strong>다. ≪說苑≫에 모아져 있는 고사들을 보<br />
면 劉向<strong>이</strong> 仁과 愛로 다스리는 왕도정치에 얼마<strong>나</strong> 큰 확신과 믿음<br />
<strong>이</strong>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諫大夫를 지낸 바 있는 劉向<strong>이</strong> 하<br />
옥되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도 임금에게 諫<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무엇인지 짐작<br />
할 수 있다.<br />
<strong>이</strong>번엔 孝사상에 대해 잘 <strong>나</strong>타난 고사를 예를 들어 보려 <strong>한</strong>다.<br />
伯兪가 잘못을 저질러 그 어머니가 종아리를 쳤다.<br />
그러자 백유가 흐느껴 울었다. <strong>이</strong>상하게 느낀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br />
었다.「다른 날에는 내가 너를 때려도 우는 것을 볼 수 없더니 지금<br />
은 무슨 연유로 우느냐?」<br />
<strong>이</strong>에 백유가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지난날에는 제가 잘못하여 어머<br />
니에게 맞을 때에 아픔을 느끼겠더니 지금은 어머니께서 힘<strong>이</strong> 달려<br />
아픔을 느낄 수 없으니 <strong>이</strong>로 인해 우는 것입니다.」<br />
그래서 세상에서는 <strong>이</strong>렇게 말하는 것<strong>이</strong>다. 부모가 노하였을 때에는<br />
반항의 뜻도 <strong>나</strong>타내지 않으며, 얼굴빛도 <strong>나</strong>타내지 않으며, 그 죄를<br />
마음 깊<strong>이</strong> 받아들여 슬퍼하며 뉘우치는 것<strong>이</strong> 최상<strong>이</strong>며, 부모가 노하<br />
였을 때는 뜻을 <strong>나</strong>타내지 않고 표정도 <strong>나</strong>타내지 않는 것<strong>이</strong> 그 此策<br />
<strong>이</strong>며 부모가 노하였을 때 뜻을 <strong>나</strong>타내며 얼굴빛을 <strong>나</strong>타내는 것을 제<br />
일 낮은 행동<strong>이</strong>다.<br />
( 伯兪有過, 其母笞之, 泣, 其母曰 : 「他日笞子未嘗見泣, 今泣何<br />
也?」 對曰 : 「他日兪得罪笞賞痛, 今母之力不能使痛, 是以泣.」故曰<br />
父母怒之, 不作於意, 不見於色, 深受其罪, 使可哀憐, 上也 : 父母怒之,<br />
不作於意, 不見其色, 其次也 : 父母怒之, 作於意, 見於色, 下也. ) 45)<br />
44) 上揭書 - 「1卷 君道 6章」P.8<br />
45) 上揭書 - 「3卷 建本 8章」P.106<br />
- 66 -
<strong>이</strong> 孝에 관<strong>한</strong> 고사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strong>한</strong> 고사<strong>이</strong>다.<br />
3卷「建本」篇에서는 사람<strong>이</strong> 살아가면서 삶의 근본<strong>이</strong> 되는 것들에<br />
대해 말하였다. 근본<strong>이</strong> 바로 선 뒤에야 덕도 서는 것임을 말하고 있<br />
는데 근본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br />
다고 말하고 있다.<br />
임금은 신하를 근본으로 삼고, 신하는 임금을 근본으로 삼는다. 또<br />
아버지는 아들을 근본으로 삼고, 아들은 아버지를 근본으로 삼아야<br />
할 것<strong>이</strong>다. 46) 다시 말해 <strong>이</strong> 것<strong>이</strong> 곧 忠<strong>이</strong>고 孝다.<br />
仁․愛․忠․孝는 유교<strong>이</strong>념의 기본<strong>이</strong> 된다 할 것<strong>이</strong>다. 仁은 임금과<br />
군자 모두가 갖추어야 할 성품<strong>이</strong>지만 愛는 특별히 임금에게 더욱<br />
강조되는 성품<strong>이</strong>다. 백성을 자식과 같<strong>이</strong> 애처롭고 가엽게 여기는 마<br />
음을 가지고 있어야 <strong>한</strong>다. 백성들의 가난함을 보고 자신의 잘못<strong>이</strong>라<br />
눈물을 흘렸다는 임금의 <strong>이</strong>야기 47)처럼 임금의 항상 백성들<strong>이</strong> 잘 살<br />
기를 관심하고 있어야 <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정치를 왕도정치라 하며 劉向<strong>이</strong><br />
여러 고사를 통하여 <strong>이</strong>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br />
유교사상<strong>이</strong> 임금의 교화를 위해 仁과 愛란 덕목을 요구하였다면<br />
백성에게 있어 孝란 백성을 교화하기 위<strong>한</strong> 덕목<strong>이</strong>었으리라 사료된<br />
다.<br />
2). 董仲舒의 儒學 思想<br />
1. 天人感應論<br />
46) 上揭書 - 「 3卷 建本 4章 」P.99 중에서<br />
47) 上揭書 - 「 1卷 君道 9章 」P.11<br />
- 67 -
董仲舒가 漢<strong>나</strong>라를 대표하는 儒學者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strong>이</strong><br />
다. 동중서는 유학을 기본으로 하여 음양오행설을 받아들여 자신만<br />
의 독특<strong>한</strong> 사상을 만들어냈다. <strong>이</strong> 사상을 통해 왕에게 간하고 군주<br />
를 경계하는데 기본 사상으로 삼았다.<br />
《春秋》는 춘추시대 242年 간의 역사 속에서 행해진 다양<strong>한</strong> 정치<br />
형태에 대<strong>한</strong> 褒貶을 기록<strong>한</strong> 책<strong>이</strong>다. <strong>한</strong>대의 춘추공양학자들은 공자<br />
가 그러<strong>한</strong> 포폄 속에서 微言을 담아 후대의 왕들<strong>이</strong> 따라야 할 법도<br />
를 수립해 놓았다고 여겼다. 즉《春秋》는 하늘의 도와 인간의 실정<br />
을 기록<strong>한</strong> 책으로, 그 기록은 옛날과 지금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br />
여 추론해낸 절대적<strong>이</strong>고 확실<strong>한</strong> 진리라고 믿었다. 따라서 춘추공양<br />
학자들은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미언 속에 담겨 있는 대의를 포착하고 재해석하여,<br />
漢王朝의 大一統的 황제지배체제 확립을 위<strong>한</strong> 국가<strong>이</strong>념의 제시를<br />
자신들의 목표<strong>이</strong>자 역사적 사명<strong>이</strong>라고 인식하였다. 춘추공약학자의<br />
대표로 인정받던 董仲舒는 가장 적극적으로 <strong>나</strong>서서 국가<strong>이</strong>념화의<br />
큰 틀인 왕조의 정통성과 군주권의 절대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br />
祥瑞와 災異의 형식으로 제기된 天人感應論은 동중서의 사상적 핵<br />
심<strong>이</strong>자 春秋學을 <strong>이</strong>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초 논리<br />
<strong>이</strong>다. 정치<strong>이</strong>론으로써의 춘추학은 천인감응론과 논리적 정합성<strong>이</strong> 확<br />
보되어야만 현실 정치에서 설득력 있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것은 동중서의 순수 창작물은 아니고 고대로부터 <strong>이</strong>어온<br />
천인관계론에서 영향을 받은 것<strong>이</strong>고 내용면에서는 《春秋》에 기록<br />
된 각종 상서<strong>나</strong> 재<strong>이</strong> 등의 철저<strong>한</strong>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br />
<strong>한</strong> 천인관계론을 정립하였다. 동중서가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논리<br />
적으로 푸는 작업을 시도<strong>한</strong> 것은 당시의 정치에 제공할 수 있는 새<br />
로운 형태의 유가 정치학 즉 춘추학의 <strong>이</strong>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br />
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br />
- 68 -
동중서의 천인감응론은 천을 중심에 두고 진행되는데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천의<br />
의지 또는 主宰性<strong>이</strong> 현실에서 표출되는 형태가 바로 祥瑞와 災異說<br />
<strong>이</strong>다. 《春秋》에 기록되어 있는 상서, 재<strong>이</strong>의 다양<strong>한</strong> 형태와 그 속<br />
에 담긴 원리는 현실 정치의 장에서 자연<strong>이</strong> 운행하는 <strong>이</strong>치를 추론<br />
하여 정치에 직접 활용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br />
상사, 재<strong>이</strong>설은 천인감응론의 핵심<strong>이</strong>자 결론<strong>이</strong>라고 할 수 있다.<br />
漢 武帝가 元光 元年 유학에 의<strong>한</strong> 지배질서 확립을 주장하면서 올<br />
린 동중서의 《賢良對策》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부터 五經博士<br />
가 설치되고 유학의 관학화가 진행된다. <strong>이</strong>때부턴 獨尊儒術에 유교<br />
적 국가<strong>이</strong>념의 확립<strong>이</strong>라는 <strong>한</strong>대만의 독특<strong>한</strong> 지배형태가 진행되기<br />
시작<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다. 당시 무제는 궁극적으로 <strong>나</strong>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strong>한</strong><br />
큰 도리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도로 정밀<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론체계를 요<br />
구하였는데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바로 天人 사<strong>이</strong>의 <strong>이</strong>치를 <strong>이</strong>해할 수 있는 체계<br />
적인 <strong>이</strong>론체계로 천인<strong>이</strong> 서로 감응하고 국가가 화합하고 통일하여<br />
모든 조직<strong>이</strong> 균형과 안정을 <strong>이</strong>루어 지속적으로 통치를 <strong>이</strong>어갈 수<br />
있는 도리<strong>이</strong>자 법칙인 것<strong>이</strong>다.<br />
동중서는 황제지배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왕조의 정통성과 군주권<br />
의 절대화를 <strong>이</strong>루기 위<strong>한</strong> 사전 작업으로 천인감응론을 바탕으로 춘<br />
추학의 형<strong>이</strong>상학적 근거를 마련<strong>한</strong>다. 세밀<strong>한</strong> 논증 작업을 통해서 구<br />
축된 그의 천인감응론은 비록 내용상으로 음양오행설을 흡수하여<br />
정통 선진유학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선진유<br />
학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의미의 학문을 <strong>이</strong>루었다고 평가받기도 <strong>한</strong><br />
다.<br />
동중서는 군주가 天命을 받아 새로운 왕조에 맞는 개혁을 단행하<br />
기 위해 왕조의 正統性을 확보해야 했다. 따라서 하늘<strong>이</strong> 천명의 증<br />
거로 祥瑞를 보여주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왕조와 군주로 인정받는<br />
것<strong>이</strong>다. 선행을 쌓고 덕을 베푸는 군주의 행동에 감응하여 하늘<strong>이</strong><br />
- 69 -
그 응답으로 특<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자연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것<strong>이</strong> 祥瑞 곧 受命<br />
의 증거라는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하늘<strong>이</strong> 장래에 군주가<br />
될 능력과 자질을 미리 부여하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군주가 하늘의 뜻을<br />
받들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 교화가 천하에 미칠 경우에 受命<br />
의 증거가 드러<strong>나</strong>는 것<strong>이</strong>다.<br />
만약 군주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여 정치를 잘 못하면 수명의<br />
증거는커녕 오히려 군주의 자리를 잃게 될 수 도 있다.<br />
동중서는 천명을 받는 것은 형식적인 과정일 뿐 왕조의 흥망성쇠<br />
는 모두 군주의 정치에 달려 있음을 강조<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것은 군주의 강력<br />
<strong>한</strong> 통치 의지를 부추겨서, 군주 스스로가 주체적<strong>이</strong>고 능동적인 태도<br />
로 <strong>나</strong>라를 <strong>이</strong>끌도록 유도하는 것<strong>이</strong>다. 다시 말해 수명을 받아 왕조<br />
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은 형식적인 장치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br />
군주의 강력<strong>한</strong> 의지와 추진력에 달려 있는 것<strong>이</strong>다.<br />
≪說苑≫의 저자 유향은 동중서의 제자로 ≪說苑≫의 고사 곳곳에<br />
서 천인감응론에 대<strong>한</strong> 의지와 신뢰를 내비치고 있다.<br />
<strong>한</strong> 예로 ≪說苑≫에 실려 있는 고사 하<strong>나</strong>를 예를 들어 보려 <strong>한</strong>다.<br />
楚 昭王<strong>이</strong>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약 말(斗)의 크기의 물체가 왕<br />
<strong>이</strong> 탄 배를 치더니 배 안으로 올라 멈추었다. 昭王<strong>이</strong> 크게 <strong>이</strong>상히<br />
여겨 孔子를 초빙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strong>이</strong>에 공자가 <strong>이</strong>렇게 설<br />
명하였다. 「<strong>이</strong>것의 <strong>이</strong>름은 萍實<strong>이</strong>며, 갈라서 그 속을 먹는 것<strong>이</strong><br />
오. 오직 霸王<strong>이</strong> 될 자만<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것을 얻을 수 있으니 <strong>이</strong>는 吉祥<strong>이</strong><br />
오.」<br />
그 후 齊<strong>나</strong>라에 다리가 하<strong>나</strong>뿐인 새가 날아와 궁전 뜰에 머물고<br />
있었다. 그 새는 깃을 편 채로 뛰어다녔다. 제후가 크게 괴<strong>이</strong>히 여<br />
겨 공자를 모셔다가 물어보도록 하였다. 孔子가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해 주<br />
었다. 「<strong>이</strong>것의 <strong>이</strong>름은 商羊<strong>이</strong>오. 어서 백성에게 고하여 물길을 수<br />
리하도록 하시오. 장차 큰비가 내릴 것<strong>이</strong>오.」<br />
- 70 -
孔子의 말대로 하자, 과연 큰비가 내려 다른 여러 <strong>나</strong>라들은 모두<br />
수해를 겪었지만 제<strong>나</strong>라만은 홀로 안전하였다. 공자가 돌아오자<br />
제자들<strong>이</strong> 물었다. 공자는 다시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strong>이</strong>상<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br />
있었지! 어린 아<strong>이</strong>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런 동요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楚王<strong>이</strong><br />
강을 건너다가 萍實을 얻었네. 크기는 말(斗)만하고 붉기는 해 같<br />
네. <strong>이</strong>를 갈라 먹어 보니 그 맛<strong>이</strong> 꿀과 같네.’ <strong>이</strong>는 바로 楚<strong>나</strong>라에<br />
해당하는 노래<strong>이</strong>다. 그리고 또 아<strong>이</strong>들<strong>이</strong> 둘씩 짝을 지어 <strong>한</strong>쪽 다<br />
리를 굽히고 뛰면서 ‘하늘<strong>이</strong> 장차 큰비를 내리려네. 商羊<strong>이</strong> 일어<strong>나</strong><br />
춤을 추네.’라고 하였지 제<strong>나</strong>라에 그런 일<strong>이</strong> 있었으니 <strong>이</strong>것은 곧<br />
제<strong>나</strong>라에 감응<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지」<br />
무릇 동요가 불린 후에는 그에 맞는 감응<strong>이</strong> 따르지 않은 적<strong>이</strong> 없<br />
었다. 그러므로 성인은 홀로 가지의 도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만<br />
물을 보고 기억해 두어 그 응함을 알아내기도 하는 것<strong>이</strong>다.<br />
( 楚昭王渡江, 有物大如斗, 直觸王舟, 止於舟中 ; 昭王大怪之, 使聘<br />
問孔子. 孔子曰 : 「此名萍實. 令剖而食之; 惟霸者, 能獲之, 此吉祥<br />
也.」<br />
其後齊有飛鳥一足來下, 止于殿前, 舒翅而跳, 齊侯大怪之, 又使聘問<br />
孔子. 孔子曰 :「此名商羊, 急告民趣治溝渠, 天將大雨.」 於是如之,<br />
天果大雨, 諸國皆水, 齊觸以安.<br />
孔子歸, 弟子請問, 孔子曰 : 「異哉小兒謠曰 : ‘楚王渡江, 得萍實,<br />
大如拳, 赤如日, 剖而食之. 美如蜜.’ 此楚之應也. 兒又有兩兩相牽,<br />
屈一足而跳子, 曰 : ‘天將大雨, 商羊起舞.’ 今齊獲之, 亦其應也.」夫<br />
謠之後, 未嘗不有應隨者也. 故聖人非獨守道而已也, 睹物記也, 卽得<br />
其眞矣. ) 48)<br />
董仲舒의 天人感應論은 인격신적인 主宰者로서의 天의 존재를 확<br />
립하고, 천과 인간의 감응관계를 통해서 천과 인간의 관계지움을 시<br />
도<strong>한</strong>다. <strong>나</strong>아가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관계지움을 바탕으로 祥瑞와 災異와 같은 하<br />
48) 上揭書 - 「 18卷 辨物 21章 」P.814<br />
- 71 -
늘의 구체적인 감응형태를 <strong>이</strong>끌어내 최종적으로 국주가 군주로서<br />
올바른 모습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strong>이</strong>다. 상서와 재<strong>이</strong>의 원리는 현<br />
실 정치의 장에서 자연<strong>이</strong> 운행하는 <strong>이</strong>치를 추론하여 정치에 직접<br />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 <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론에서 주목할 만<br />
<strong>한</strong> 것은 천의 의지와 주재성<strong>이</strong> 아니라 인간, 다시 말해 군주의 자새<br />
와 역할<strong>이</strong>다. 현실정치에서 군주의 주체적<strong>이</strong>고 능동적인 자세가 확<br />
립되어야만 강력<strong>한</strong> 군주의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유가의 정치<strong>이</strong>상인<br />
덕치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 따라서 동중서 천인감<br />
응론은 그의 춘추학 체계 내에서 춘추학의 최종목표인 大一統的인<br />
황제지배체제의 확립을 위<strong>한</strong> 중요<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론적 근거로써의 역할을 수<br />
행<strong>한</strong>다고 할 수 있다.<br />
2. 災異說<br />
董仲舒의 災異說은 孔子의《春秋》 災異記錄에 그 연원을 두고 있<br />
다. 공자는 《春秋》에 매 년대의 자연재해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br />
재<strong>이</strong>의 기록을 통해 치정과 천의의 관계를 암시하므로 천과 인간은<br />
서로 감응됨을 <strong>나</strong>타내 보<strong>이</strong>고자 하였다. 동중서는 적극적으로 음양<br />
학설을 도입하여 독특<strong>한</strong> 災異學說을 세웠다. 자연재해는 단순<strong>한</strong> 자<br />
연발생적 재해만을 기록<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아니라 하늘의 군주에 대<strong>한</strong> 계시성<br />
의 경고가 담겨 있음을 말 할 수 있다. 동중서의 관점에서 살펴볼<br />
때 재<strong>이</strong>의 발생원인은 군왕의 실덕과 치리의 부조화에 있다고 볼<br />
수 있다. 그러므로 재<strong>이</strong>를 예방하고 태평<strong>한</strong> <strong>나</strong>라를 여는 것<strong>이</strong> 치국<br />
의 근본<strong>이</strong>라 하겠다. <strong>한</strong>대의 많은 유학자들도 <strong>이</strong>와 비슷<strong>한</strong> 견해를<br />
피력하였다. <strong>이</strong>는 진의 명망<strong>이</strong>후 받은 교훈에서 <strong>이</strong>를 반성하고 그<br />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에서 얻어진 것<strong>이</strong>다.<br />
- 72 -
동중서는 음양오행으로 천인관계를 설명하였다. 자연계의 모든 변<br />
화는 天地之氣에 의해 운행된다고 보았는데 인간과 자연의 기가 서<br />
로 감응할 수 있다는 생각<strong>이</strong> 재<strong>이</strong>설의 <strong>이</strong>론적 기초가 된다.<br />
재<strong>이</strong>의 발생 원인<strong>이</strong> 음양의 부조화로 인<strong>한</strong> 사기가 생긴 것으로 동<br />
중서는 재<strong>이</strong>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양<strong>이</strong> 조화를 <strong>이</strong>뤄야하고 정치<br />
교화에 의해 해결하려 하였다. <strong>한</strong>대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음양설을<br />
천인관계안에 포함하여 그들의 사상적 <strong>이</strong>론의 완성을 꾀하려 하였<br />
고 음양의 조화를 강조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br />
동중서에게 있어서도 정치의 최고 목적은 바로 음양의 조화<strong>이</strong>다.<br />
재<strong>이</strong>의 기록을 통해 천과 인<strong>이</strong> 감응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여 재<br />
<strong>이</strong>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주된 원인은 군왕의 실정에 있음을 말<br />
하려 하였다.<br />
동중서 天人感應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을 인격화하여 神聖視<strong>한</strong><br />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것은 자연을 신비화시켜 숭배<strong>한</strong> 원시신앙의 형태가 아니<br />
라 자연에 감정을 개입하여 상징의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strong>한</strong> 것으로<br />
보인다. 천의가 재<strong>이</strong>를 통해 드러<strong>나</strong>는 것은 인간에게 경계하게 하는<br />
것<strong>이</strong>지 결코 인간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즉 천은 인간의 잘못을 반<br />
성케 하고 구원하는데 목적<strong>이</strong> 있다.<br />
재<strong>이</strong>는 동중서에게 있어 정신적 신앙<strong>이</strong>었으며 정치철학에 있어 확<br />
실<strong>한</strong> 신념<strong>이</strong>기도 하였다. <strong>이</strong>것은 동중서 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상에<br />
있어 독특<strong>한</strong> 신앙 혹은 신념의 형태로 내려오고 있다.<br />
유향의 시기에는 천명사상에 독실<strong>한</strong> 믿음을 가졌던 유신들<strong>이</strong> 재<strong>이</strong><br />
에 대해 자주 언급하거<strong>나</strong> 상소를 올렸으며 참형에 처해지는 사례도<br />
많았다. 그들은 모두 의로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strong>이</strong>것<br />
은 천인재<strong>이</strong>에 대해 그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끔 <strong>한</strong>다.<br />
≪說苑≫에도 재<strong>이</strong>에 대<strong>한</strong> 고사가 여러개 보인다. 여기에 그 예를<br />
- 73 -
들어 보려 <strong>한</strong>다.<br />
晉 平公<strong>이</strong> 虒祁에 궁실을 짓자. 그 가운데 어떤 돌<strong>이</strong> 말을 하는<br />
것<strong>이</strong>었다. 平公<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상히 여겨 師曠에게 물었다.<br />
「돌<strong>이</strong> 어찌 말을 할 수 있습니까?」師曠<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br />
「돌은 말을 하지 못하지요. 신<strong>이</strong> 돌을 통해서 말하는 것<strong>이</strong>지요.<br />
그렇지 않다면 백성들<strong>이</strong> 무언가를 잘 못 들었거<strong>나</strong>요. 제가 들으니<br />
‘일을 벌<strong>이</strong>되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 그 원망<strong>이</strong> 백성을 움직<strong>이</strong>면,<br />
말하지 못하는 물건<strong>이</strong> 말을 <strong>한</strong>다.’ 고 하더<strong>이</strong>다. 지금 궁실을 <strong>이</strong>렇<br />
듯 높고 사치스럽게 짓자니, 백성들<strong>이</strong> 그 힘<strong>이</strong> 다하여 그 미움과<br />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strong>이</strong>상 그 성정을 편안히 할 수가<br />
없지요. 그러니 돌<strong>이</strong> 말을 <strong>한</strong>다는 것<strong>이</strong> 꼭 불가능<strong>한</strong> 일<strong>이</strong>겠습니<br />
까?」( 晉平公築虒祁之室, 石有言子. 平公問於師曠曰 : 「石何故<br />
言?」對曰 : 「石不能言, 有神憑焉; 不然, 民聽之濫也. 臣聞之, ‘作<br />
事不時, 怨讀動於民, 則有非言之物而言.’ 今宮室崇侈, 民力屈盡, 百<br />
姓疾怨, 莫安其性, 石言不亦可乎?」) 49)<br />
예문에서 보<strong>이</strong>듯 말하는 돌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strong>이</strong>는 일을<br />
통해 하늘은 인간에게 경고하고 두려워 반성하게 <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것은 하<strong>나</strong><br />
의 계시<strong>이</strong>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것은 종교적인 계시가 아니라 정치적인 계시<br />
로 천<strong>이</strong> 재<strong>이</strong>를 내리는 목적과 의도는 곧 정치를 통해 실현하는데<br />
있다. 선정을 베푸는 군왕의 시기에는 재<strong>이</strong>가 없다.<br />
군왕의 治理의 중요<strong>한</strong> 방법은 敎化로, 교화란 민심을 고르게 하는<br />
데 있다. 민심의 안정은 서기에 의해 천하가 화평해질 수 있다고 보<br />
았으<strong>나</strong> 악정은 반드시 악기를 조성시켜 재해를 일으킨다고 보았다.<br />
따라서 교화란 재<strong>이</strong>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유일<strong>한</strong> 방법<strong>이</strong>기도<br />
하다. 다시 말해 재<strong>이</strong>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예방할 수 있는 정치성<br />
49)上揭書 -「 18卷 辨物 24章」P.819<br />
- 74 -
의 문제인 것<strong>이</strong>다. 재<strong>이</strong>는 자연<strong>이</strong>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strong>이</strong> 아니라<br />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동중서는 재<strong>이</strong>의 원인적 요소를 밝혀 天道가 완전하게 실현되는<br />
결과를 기대하였던 것<strong>이</strong>다. 50)<br />
(2). 道家的 性格<br />
도교와 도가를 구분하여 사용<strong>한</strong>다면 <strong>이</strong> 책에서는 초기의 巫俗的<br />
인 요소와 方術을 배제하고 노장철학의 신선 사상<strong>이</strong> 가미된 道家的<br />
요소가 <strong>나</strong>타난다 하겠다. 신선사상과 방술로 하<strong>나</strong>의 무속 종교화된<br />
道敎的 性格<strong>이</strong> 아닌 無爲로 표현되는 老莊의 철학<strong>이</strong> ≪說苑≫의 곳<br />
곳에서 보<strong>이</strong>고 있다. 老子의 말로만 <strong>이</strong>루어진 고사도 종종 보인다.<br />
齊<strong>나</strong>라 宣王<strong>이</strong> 윤문자에게 물었다.「人君之事에는 어떤 것<strong>이</strong> 있습<br />
니까?」 윤문자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 「인군지사는 아무런 作爲 없<br />
<strong>이</strong>도 아랫사람들을 능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릇 일<br />
을 줄여 주어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법을 덜어 주어 <strong>이</strong><br />
를 지키기 쉽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백성들<strong>이</strong> 정치 때문에 죄를<br />
짓는 일<strong>이</strong> 없어집니다. 큰 도는 무리를 용납하며, 큰 덕<strong>이</strong>란 아랫사<br />
람까지 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인은 작위를 적게 하면서도 천하<br />
가 잘 다스려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서경에 예지는 성을<br />
<strong>이</strong>루게 <strong>한</strong>다라고 <strong>한</strong> 것입니다. 또 시인<strong>이</strong> 岐땅에서 베푼 바른 행동<br />
50) 정<strong>한</strong>균, 〈동중서 재<strong>이</strong>설의 신앙형태적 연구〉,《<strong>한</strong>국종교사연구》 11<br />
권, <strong>한</strong>국종교사학회, 2003<br />
김동민, 〈동중서 춘추학의 천인감응론에 대<strong>한</strong> 고찰 - 상서․재<strong>이</strong>설을<br />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36권, 동양철학연구회 2004<br />
남상호, 〈동중서 천인감응의 방법〉,《범<strong>한</strong>철학》22, 범<strong>한</strong>철학회, 2001<br />
<strong>이</strong>연승, 〈동중서 연구사〉, 《<strong>한</strong>국종교연구회 회보》8권, <strong>한</strong>국종교연<br />
구소(舊 <strong>한</strong>국종교연구회), 1999<br />
- 75 -
그 자손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를 지켜 <strong>나</strong>가리라고 읋은 것도 <strong>이</strong>를 두고 <strong>한</strong> 말입니<br />
다」 선왕<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 「좋다」라고 하였다.<br />
( 齊宣王謂尹文曰 : 「人君之事, 何如?」 尹文對왈 : 「人君之事, 無<br />
爲而能容下. 夫使寡易從, 法省易人 ; 故民不以政獲罪也. 大道容衆, 大<br />
德容下 ; 聖人寡爲而天下理矣. 書曰 : 『 作聖』 詩人曰 : 『岐有夷<br />
之行, 子孫其保之.』 宣王曰 : 「善」) 51)<br />
위의 예문에서 보<strong>이</strong>는 도가 사상의 핵심은 無와 無爲<strong>이</strong>다. 有보다<br />
는 無를 우위에 두고 있다. 만물의 본체는 無<strong>이</strong>며 무에서 有가 <strong>나</strong>오<br />
는 체계<strong>이</strong>다.<br />
常摐<strong>이</strong> 병<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자 노자가 찾아가 여쭈었다. 「선생님의 병<strong>이</strong> 중<br />
하시군요. 우리 여러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겨 주실 말씀<strong>이</strong> 없으<br />
신지요?」 <strong>이</strong>에 상창은 <strong>이</strong>렇게 말하였다.「그대가 묻지 않았더라<br />
도 내 그 대에게 말해 주려 했었지!」그리고는 말을 <strong>이</strong>었다.「사람<br />
들은 고향을 지<strong>나</strong>게 되면 수레에서 내리게 되지. 그 <strong>이</strong>유를 아는<br />
가?」 노자가 대답하였다. 「고향을 지<strong>나</strong>다가 수레에서 내리는 것<br />
은 고향을 잊지 못하기 때문<strong>이</strong> 아닙니까?」「아무렴, 맞는 말<strong>이</strong><br />
지」하고는 상창<strong>이</strong> 다시 물었다.「큰 교목을 지<strong>나</strong>다가는 그리로<br />
달여간다. 그 <strong>이</strong>유를 아는가?」 <strong>이</strong>에 노자는 「큰 교목을 보고 달<br />
려가는 것은 늙은<strong>이</strong>를 공경<strong>한</strong>다는 뜻<strong>이</strong> 아닙니까?」라고 하였다.<br />
그러자 상창<strong>이</strong> 「아무렴, 그렇고 말고」하고는 자신의 입을 벌려<br />
노자에게 보여 주면서 물었다. 「내 혀가 있느냐?」<strong>이</strong>말에 노자가<br />
있다고 대답하자, 상창<strong>이</strong> 다시 「그럼 <strong>이</strong>빨은 그대로 있느냐?」고<br />
물었다. <strong>이</strong>에 노자는 「다 빠지고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무릇<br />
혀가 그대로 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strong>이</strong> 아닙니까? 또 <strong>이</strong>빨<strong>이</strong> 바<br />
지는 것은 강하기 때문<strong>이</strong> 아니겠습니까?」<br />
51) 上揭書 - 「1卷 君道 2章」P.3<br />
- 76 -
그러자 상창<strong>이</strong> 「아무렴, 맞는 말<strong>이</strong>다. 천하의 원리를 다하였으니<br />
내 무엇으로 그대에게 말해 줄게 있으랴!」라고 하였다.<br />
( 常摐有疾, 老子往問, 曰 : 「先生疾甚矣, 無遣敎可以語諸弟子者<br />
乎?」常摐曰 :「子雖不問, 吾將語子.」常摐曰 : 「過故鄕而下車, 子<br />
知之乎?」老子曰 :「過故鄕而下車, 非謂其不忘故耶?」常摐曰 :「嘻,<br />
是己.」張其口而示老子曰: 「吾舌存乎?」老子曰 : 「然」「吾齒存<br />
乎?」老子曰 : 「亡」常摐曰 : 「子知之乎?」老子曰 : 「嘻, 是己.<br />
天下之事已盡矣. 何以復語子哉!」) 52)<br />
<strong>이</strong>처럼 강<strong>한</strong> 것보다 약<strong>한</strong> 것을 더 신뢰<strong>한</strong>다. 노자철학은 弱者의 편<br />
에 선 철학<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다.<br />
<strong>이</strong> 철학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는 강자는 반드시 소멸하게 되<br />
어 있다는 사실<strong>이</strong>다. 약<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반드시 <strong>이</strong>기기 마련인 것<strong>이</strong>다. 발뒤<br />
꿈치를 들고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으며(企者不立), 강풍은 아침 내<br />
내 불 수 없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릴 수 없는 법인 것<strong>이</strong>다.(飄風不<br />
終朝 驟雨不終日)<br />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사상은 莊子, 列子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계승되었으<strong>나</strong><br />
더욱 중요<strong>한</strong> 것은 儒家에서도 도가를 계속 읽고 해석하였다는 사실<br />
일 것<strong>이</strong>다.<br />
위에서 예로 든 고사 <strong>이</strong>외에 ≪說苑≫안에는 도가 철학<strong>이</strong> 드러난<br />
고사로 第 10卷 「敬愼」의 8章<strong>이</strong> 노자의 말을 직접 인용<strong>한</strong> 고사로<br />
총 두 편<strong>이</strong> 실려있다.<br />
<strong>이</strong>상 앞에서 ≪說苑≫에 <strong>나</strong>타<strong>나</strong>는 여러 사상들에 대해 살펴보았<br />
다. <strong>이</strong> 책의 저자인 劉向과 그의 스승<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대를 대표하는 大儒學者<br />
<strong>이</strong>기에 儒學<strong>이</strong> ≪說苑≫의 저술에 있어 근간<strong>이</strong> 된 사상임은 의심할<br />
52) 上揭書 - 「10卷 敬愼 5章」P.418<br />
- 77 -
바 아니다. 유향은 유학을 기본으로 하고 스승인 董仲舒의 사상 역<br />
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br />
그리고 ≪說苑≫을 읽다 보면 道家的 思想까지 겸하여서 유향의<br />
학술적 해박함을 느낄 수 있다. 또<strong>한</strong> ≪說苑≫<strong>이</strong>라는 책의 독자가<br />
어찌 보면 제<strong>한</strong>적 일 수 있기에 군신관계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br />
있다. 또 그의 유교적 사상 또<strong>한</strong> 다른 부분과는 달리 군신관계에 있<br />
어서는 매우 엄격함을 알 수 있다.<br />
- 78 -
다.<br />
第Ⅳ章. 體裁 및 描寫技法에 따른 分類<br />
第Ⅳ章에서는 ≪說苑≫의 고사들을 묘사기법에 따라 <strong>나</strong>눠보려 <strong>한</strong><br />
앞에서도 말하였듯 대부분의 고사가 두 사람<strong>이</strong> 등장하는 대화체의<br />
문장<strong>이</strong>다. 그 문장들 가운데에서 대화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였는지<br />
를 세분하여 보았다. 또 특정화자 없<strong>이</strong> 기술된 문장도 있다.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문장을 찾아 따로 분류하였으며 앞에서 보였던 바와 같<strong>이</strong> 특정 인<br />
물<strong>이</strong> 단독화자로 등장하는 문장을 찾아 ≪說苑≫에 등장하는 서술<br />
기법을 세분하였다.<br />
第1節. 對話體的 記述<br />
(1). 대화를 통해 도를 밝힘<br />
≪說苑≫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고사들의 등장인물은 대략 2명<br />
<strong>이</strong>상<strong>이</strong>다.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 하<strong>나</strong>는 묻고 하<strong>나</strong>는 대답하는 경우<br />
가 일반적<strong>이</strong>고 대부분<strong>이</strong>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실천해야할 유<br />
교<strong>이</strong>념<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도리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br />
다음에 보<strong>이</strong>는 고사는 대화를 통하여 道와 思想에 대해 피력하고<br />
있는 경우<strong>이</strong>다.<br />
季康子가 子游에게 물었다. 「인자도 남을 사랑합니까?」<br />
「그렇소!」 「그럼 남도 역시 그를 사랑합니까?」 그러자 강자가<br />
- 79 -
다시 물었다.「그렇다면 鄭<strong>나</strong>라 子産<strong>이</strong> 죽자, 鄭<strong>나</strong>라 사람들 모두 몸<br />
의 장식을 떼고 부인들은 귀걸<strong>이</strong>를 풀고 부부가 골목에 <strong>나</strong>와 통곡하<br />
였으며 석 달 동안<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애도하였습<br />
니다. 그러<strong>나</strong> 仲尼가 죽었을 때, <strong>나</strong>는 魯<strong>나</strong>라 사람들<strong>이</strong> 그 선생을 사<br />
랑하여 어떤 애통을 했다는 소문도 듣지 못했소. <strong>이</strong>는 무슨 <strong>이</strong>유입<br />
니까? 」 <strong>이</strong>에 子游가 <strong>이</strong>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br />
「비유컨대 子産과 우리 선생님은 물을 적셔 주는 것과 하늘에서 비<br />
를 내려주는 차<strong>이</strong>와 같습니다. 물을 적셔 주면 그 물<strong>이</strong> 닿는 곳의<br />
식물은 자라지만, 그물<strong>이</strong> 미치지 못하는 곳은 말라죽습니다. 그러<strong>나</strong><br />
<strong>이</strong> 백성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어야 살 수 있습<br />
니다. <strong>이</strong>미 만물을 살려 주되, 그 내려 주는 비를 아까워하지 않는<br />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하건데, 자산과 선생님의 차<strong>이</strong>는 바로 물을 적<br />
셔 줌과 하늘에서 비를 내려 줌과 같다고 <strong>한</strong> 것입니다.」<br />
( 季康子謂子游曰 : 「仁者愛人乎?」子游曰 : 「然.」「人亦愛之<br />
乎?」子游曰 : 「然」康子曰 : 「鄭子産死, 鄭人丈不舍玦佩, 婦人舍珠<br />
珥, 夫婦巷哭, 三月不聞竽瑟之聲. 仲尼之死, 吾不聞魯國之愛夫子,<br />
也?」子游曰 : 「譬子産之與夫子, 其猶浸水之與天雨乎! 浸水所及則生,<br />
不及則死, 私民之生也, 必以時雨, 卽以生, 莫愛其賜. 故曰 : 譬子産之<br />
與夫子也, 猶浸水之與天雨乎!」) 53)<br />
<strong>이</strong>렇듯 대화를 통해 묻고 질문하고 또 다시 물으며 화자가 말하<br />
고자 하는 어떤 道를 드러내고 있다. <strong>이</strong> 예문에서는 공자의 도는<br />
매우 커서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 백성들<strong>이</strong> 당장 소중함<br />
을 느끼지 못<strong>한</strong>다고 말하고 있다.<br />
(2). 대화를 통해 심리와 성격을 묘사함<br />
53) 上揭書 - 「5卷 貴德 18章」P.186<br />
- 80 -
역시 두 사람<strong>이</strong> 등장하여 대화를 <strong>나</strong>누며 등장인물의 성격 또는<br />
대화하고 있는 당시의 심리상태를 보여주고 있다.<br />
晏子가 景公을 곁에 모시고 있을 때였다. 아침<strong>이</strong>라 날<strong>이</strong> 춥자 경공<br />
<strong>이</strong> 안자에게 따뜻<strong>한</strong> 음식을 가져오라고 청하였다. 그러자 안자가<br />
「<strong>나</strong> 晏嬰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신하가 아닙니다. 감히 거부합<br />
니다」라고 하였다.<br />
경공<strong>이</strong> 다시 「그럼 추우니 가죽 외투 좀 갖다 주시오!」라고 하였<br />
다. 다시 안자는 「<strong>나</strong>는 사냥<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고기 잡은 신하가 아니오! 감히 거<br />
부합니다.」라고 하였다. 경공은 <strong>이</strong>에 화를 내며 <strong>이</strong>렇게 물었다.<br />
「그렇다면 선생께서는 제게 도대체 어떤 사람<strong>이</strong>오?」안자는 대답<br />
하기를 「사직지신<strong>이</strong>지요!」라고 하였다. 경공은 「사직지신<strong>이</strong>란 게<br />
뭐요?」라고 물었다. 안자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br />
「사직지신<strong>이</strong>란 능히 사직을 바로 세우고 상하의 마땅함을 別하여<br />
그 <strong>이</strong>치에 맞도록 하지요. 그리고 백관의 질서를 제정하여 각기 마<br />
땅함을 얻도록 해주며, 법령을 마련하여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사방에 널리 퍼지도<br />
록 하는 것입니다.」<br />
<strong>이</strong>로부터 경공은 예가 아닌 것으로는 감히 안자를 부리거<strong>나</strong> 시키지<br />
않았다.<br />
( 晏子侍於景公, 朝寒請進熱食, 對曰 : 「嬰非君之廚養臣也, 敢辭.」<br />
公曰 :「請進服裘.」對曰 : 「嬰非田澤之臣也, 敢辭.」公曰 : 「然, 夫<br />
子於寡人溪爲者也?」對曰 :「社稷之臣也.」公曰 : 「何謂社稷之臣?」<br />
對曰 : 「社稷之臣, 能立社稷, 辨上下之宜, 使得其理 ; 制百官之序, 使<br />
得其宜 ; 作爲辭令, 可分布於四方.」自是之後, 君不以禮不見晏子也.<br />
) 54)<br />
≪說苑≫의 대부분의 고사들<strong>이</strong> 도를 밝히는 것<strong>이</strong>기 때문에 인물<br />
54) 上揭書 - 「2卷 臣術 11章」P.77<br />
- 81 -
의 심리<strong>나</strong> 성격을 묘사<strong>한</strong> 고사를 찾기는 사실 일<strong>이</strong> 아니었다. 하지<br />
만 그 중 <strong>이</strong> 예문<strong>이</strong> 가장 등장인물의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성품과<br />
심리를 잘 드러낸 것<strong>이</strong>기에 <strong>이</strong> 예문을 선택하였다.<br />
景公은 후대에까지 기억되는 훌륭<strong>한</strong> 왕<strong>이</strong>지만 <strong>이</strong>때에는 자신<strong>이</strong> 춥<br />
다고 晏子에게 사소<strong>한</strong> 심부름을 하고 있다.<br />
안자는 자신은 그런 사소<strong>한</strong> 심부름은 할 수 없음을 말<strong>한</strong>다. <strong>이</strong>에<br />
景公은 화를 내며 ‘晏子 당신은 그럼 어떤 신하인가?’ <strong>이</strong>렇게 묻는<br />
다. 둘 사<strong>이</strong>의 팽팽<strong>한</strong> 긴장감<strong>이</strong> 느껴진다. <strong>이</strong>렇게 둘 사<strong>이</strong>의 심리<br />
상태를 묘사<strong>한</strong> 고사도 있다.<br />
第2節. 直述的 記述<br />
대부분 문답<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대화를 통해 道를 밝히고 주제를 드러내고 있지<br />
만 등장인물도 없<strong>이</strong> 쓰여있으므로 어록의 형태도 아닌 고사들<strong>이</strong> 있<br />
다. 서술 형태로만 쓰인 것<strong>이</strong>다. 총 800여 개의 고사 가운데 대략<br />
80여章<strong>이</strong> 그러<strong>한</strong> 모습을 하고 있다.<br />
다음의 고사는 그러<strong>한</strong> 특징을 잘 보<strong>이</strong>고 있어 <strong>한</strong>편을 소개<strong>한</strong>다.<br />
윗사람을 높<strong>이</strong>고 어진 <strong>이</strong>를 존중하며 남에게 교만하게 굴지<br />
말아야 <strong>한</strong>다. 총명하고 성스러운 지혜를 가진 자는 남을 궁지<br />
에 몰지 않으며, 天品<strong>이</strong> 민첩할수록 남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br />
또 스스로가 강의하고 용맹하다고 해서 남을 <strong>이</strong>기려고 들어<br />
서도 안 된다. 비록 지혜롭다 해도 반드시 그 바탕을 살펴본<br />
연후에야 <strong>이</strong>를 辨析하며 비록 능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양보<strong>한</strong><br />
<strong>이</strong>후에야 <strong>이</strong>를 맡아야 <strong>한</strong>다.<br />
- 82 -
그러므로 선비란 비록 총명하고 성지가 있다 해도 스스로는<br />
어리석음으로 지켜야 하고, 그 공<strong>이</strong> 천하를 덮을지라도 스스<br />
로는 양보로써 지키며, 勇力<strong>이</strong> 세상을 막을 수 있다 해도 스<br />
스로는 怯弱으로 지키고, 부가 천하를 다 가졌다 해도 染織으<br />
로 지켜야 <strong>한</strong>다.<br />
<strong>이</strong>렇게 하는 자는 가히 높<strong>이</strong> 있어도 위험하지 않고, 가득 차<br />
고도 넘치지 않을 것<strong>이</strong>라 말할 수 있다.<br />
( 高上尊賢, 無以驕人 : 聰明聖智, 無以窮人 ; 資給疾速, 無以先人 ;<br />
剛毅勇猛, 無以勝人. 不知則問, 不能則學. 雖智必質, 然後辨之 : 雖能<br />
必讓, 然後爲之 : 故士雖聰明聖智, 自守以愚 ; 功被天下, 自守以讓 :<br />
勇力距世, 自守以怯 : 富有天下, 自守以兼 ; 此所謂高而不危, 滿而不<br />
益者也. ) 55)<br />
<strong>이</strong>렇게 특정<strong>한</strong> 화자가 없기에 어떤 특정 시점에서 쓰여지기 보다<br />
오늘날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모양으로 쓰여있다.<br />
<strong>이</strong> 예문에서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strong>한</strong> 의도가 엿보인다.<br />
第3節. 引用的 記述<br />
앞에서 누차 말하였듯 ≪說苑≫의 고사 대부분<strong>이</strong> 두 명 <strong>이</strong>상의<br />
대화 내지는 문답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strong>나</strong> 말하는 사람 <strong>이</strong>외의<br />
등장 인물<strong>이</strong> 없<strong>이</strong> 등장<strong>한</strong> <strong>한</strong> 사람만<strong>이</strong> 단독으로 <strong>이</strong>야기하는 형식을<br />
引用的 記述<strong>이</strong>라 <strong>이</strong>름하여 분류해 보았다. 총 850편 정도의 고사 가<br />
운데 40편 정도가 <strong>이</strong>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출현<strong>이</strong> 잦<br />
55) 上揭書 - 「10卷 敬愼 20章」P.437<br />
- 83 -
은 孔子의 고사를 소개해 보려<strong>한</strong>다.<br />
孔子가 말하였다.「군자는 本에 힘쓸지니 본<strong>이</strong> 서면 도가 생긴<br />
다.」무릇 근본<strong>이</strong> 바르지 못<strong>한</strong> 것은 그 끝<strong>이</strong> 반드시 기울게 되고, 시<br />
작<strong>이</strong> 흥성하지 못하면 그 끝<strong>이</strong> 반드시 衰竭하게 마련<strong>이</strong>다.<br />
그래서 詩에 『언덕<strong>이</strong> 평평하면 그 샘물도 흘러 맑기 마련일세!』<br />
라고 하였던 것<strong>이</strong>다. 『본<strong>이</strong> 서면 길<strong>이</strong> 생긴다』라는 말은 春秋의<br />
義<strong>이</strong>다.<br />
봄에 씨 뿌려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거둘 것<strong>이</strong> 없어 어지러워지는<br />
일<strong>이</strong> 없듯<strong>이</strong>, 임금의 도리를 바르게 지키는 자는 국가가 위험해질<br />
리가 없다. 易에는 『그 근본을 바르게 세우면 만물<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치대로 다<br />
스려진다. 그러<strong>나</strong> <strong>이</strong>를 털끝만큼<strong>이</strong>라도 놓치면 그 결과와의 차<strong>이</strong>는<br />
1천 리<strong>나</strong> 된다.』라고 하였다, <strong>이</strong> 까닭으로 군자는 그 근본 세우기를<br />
귀하게 여기며, 그 시작 세우기를 중히 여긴다.<br />
( 孔子曰: 「君子務本, 本位而道生.」 夫本不正者未必埼, 始不盛者終<br />
必衰. 詩云: 『原濕卽平 泉流卽淸.』 本位而道生, 春秋之義; 有正春者<br />
無亂秋, 有正君者無危國, 易曰: 『建其本而萬物理, 失之毫 , 差以千<br />
里.』 是故君子貴建本而重立始. ) 56)<br />
<strong>이</strong> 章에서는 ≪說苑≫의 고사들에 사용된 묘사기법을 3가지 기준<br />
에 의거하여 <strong>나</strong>눠보았다.<br />
두 사람<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그 <strong>이</strong>상<strong>이</strong> 등장하여 대화를 <strong>나</strong>누는 고사들은 ‘대화체<br />
적 기술’의 기법을 사용<strong>한</strong> 고사로 <strong>나</strong>누었는데 그 고사를 다시 대화<br />
중 道를 드러낸 고사와 인물들의 심리를 묘사<strong>한</strong> 고사로 <strong>나</strong>누어 보<br />
았다.<br />
또 ≪說苑≫에 소개된 고사 중 가장 특<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모양새를 갖춘 고사로<br />
56) 上揭書 - 「3卷 建本 1章」P.97<br />
- 84 -
특정화자 없<strong>이</strong> 기술된 문장<strong>이</strong> 있는데 <strong>이</strong>를 찾아 분류하였다.<br />
그리고 저자인 劉向<strong>이</strong> 평소 존경의 마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보<strong>이</strong><br />
는 인물들로 一人 화자가 등장하는 고사들<strong>이</strong> 있는데 <strong>이</strong>들은 대부분<br />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들<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 고사들<br />
에 劉向<strong>이</strong>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집중되는 경향<strong>이</strong> 있다.<br />
第Ⅳ章에서는 ≪說苑≫의 고사들을 묘사기법에 따라 분류해 보았<br />
다. 대부분의 고사가 두 사람<strong>이</strong> 등장하는 대화체의 문장으로 그 고<br />
사들을 다시 대화의 중심 내용을 <strong>이</strong>용하여 세분하였다.<br />
특정화자 없<strong>이</strong> 기술된 문장<strong>이</strong> 있다.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문장을 찾아 따로 분<br />
류하였으며 앞에서 보였던 바와 같<strong>이</strong> 특정 인물<strong>이</strong> 단독화자로 등장<br />
하는 문장을 찾아 ≪說苑≫에 등장하는 서술기법을 세분하였다. 등<br />
장인물도 없<strong>이</strong> 쓰여졌으며 어록의 형태도 아닌 고사들은 서술 형태<br />
로만 쓰인 것<strong>이</strong>다. 총 850여 개의 고사 가운데 대략 80章 정도가 그<br />
러<strong>한</strong> 모습을 하고 있다.<br />
말하는 사람 <strong>이</strong>외의 등장 인물<strong>이</strong> 없<strong>이</strong> 등장<strong>한</strong> <strong>한</strong> 사람만<strong>이</strong> 단독으<br />
로 <strong>이</strong>야기하는 형식, 마치 어록처럼 보<strong>이</strong>는 형태의 고사를 引用的<br />
記述<strong>이</strong>라 분류하였다. 총 800편 가량의 고사 가운데 40편 정도가 <strong>이</strong><br />
런 형식을 취하고 있다.<br />
- 85 -
第Ⅴ章. ≪說苑≫의 敎訓性과 文學的 價値<br />
≪說苑≫은 유가의 사상과 <strong>이</strong>념을 피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br />
교훈적인 책<strong>이</strong>다. 第Ⅴ章에서는 ≪說苑≫의 고사들<strong>이</strong> 가지고 있는<br />
교훈적 성격에 주목하여 윤리적 측면에서와 정치적 측면에서의 교<br />
훈성에 대해 생각해 보려 <strong>한</strong>다. 따라서 <strong>이</strong>런 교훈적 성격<strong>이</strong> 가장 잘<br />
드러<strong>나</strong> 있는 고사를 하<strong>나</strong> 취하여 예로 들 것<strong>이</strong>다.<br />
또<strong>한</strong> 그 교훈들<strong>이</strong>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br />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려 <strong>한</strong>다.<br />
≪說苑≫<strong>이</strong>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strong>이</strong> 著書가 가지고 있는<br />
문학적 가치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소설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br />
며 소설사적으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 생각해 보려<br />
<strong>한</strong>다.<br />
第1節. ≪說苑≫에서 보<strong>이</strong>는 敎訓性<br />
또<strong>한</strong> 교훈성을 애매하게 어떤 교훈에 대해 얘기할 것<strong>이</strong> 아니라<br />
윤리적인 측면의 교훈성과 정치적 측면의 교훈성으로 분류하여 분<br />
석하고 그 예를 들었다.<br />
(1). 倫理的인 側面의 敎訓性<br />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윤리법칙으로 권선징악<br />
- 86 -
과 인과응보를 들 수 있을 것<strong>이</strong>다. 착<strong>한</strong> 것을 권장하고 악<strong>한</strong> 것을<br />
징계하는 권선징악과 선<strong>한</strong>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strong>한</strong> 보답을 받<br />
고 악<strong>한</strong> 일을 하게 되면 벌을 받는 인과응보, 모두 착<strong>한</strong> 일을 하면<br />
<strong>나</strong>중에 그에 대<strong>한</strong> 상을 받고 악<strong>한</strong>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공<br />
통점을 가지고 있다.<br />
3卷의「建本」편에서 <strong>나</strong>오는 고사들 가운데 윤리적인 측면의 교훈<br />
을 강조하고 있는 고사들<strong>이</strong> 있다.<br />
인과응보와 권선징악<strong>이</strong> 사람<strong>이</strong> 살아가는 윤리에 기본<strong>이</strong>라 하겠지<br />
만 주된 주제로 孝에 대해 <strong>이</strong>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효를 행하고<br />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살게 되면 하늘<strong>이</strong> 그를 갚아준다는 내용으로<br />
일반인들에게 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하는<br />
의도가 엿보인다.<br />
3卷의 「建本」編의 가난<strong>한</strong> 집에서 늙은 어버<strong>이</strong>를 모시는 자는 그<br />
녹을 따지 않고 벼슬을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5章, 어버<strong>이</strong>가 작<br />
은 회초리를 들어 때릴 때는 곁에 있어도 어버<strong>이</strong>의 暴怒를 대할 때<br />
는 자리를 피하여 아버지로서의 義과 자식으로의 孝를 강조하고 있<br />
는 7章,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맞으며 그 힘<strong>이</strong> 약해짐을 느끼고 눈<br />
물을 흘렸다는 伯兪의 고사가 <strong>나</strong>오는 8章<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를 잘 보여준다.<br />
또 6卷의 「復恩」編에서도 은혜를 베풀면 꼭 그 사람에게서가 아<br />
니더라도 후대에라도 꼭 보답을 받는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br />
베푼 陰德은 후에 꼭 보상을 받음을 말하는 6卷의 「復恩」編의<br />
7章, 자기가 아끼는 말을 잃은 후 찾아보니 사람들<strong>이</strong> 그 말을 잡아<br />
먹고 있었으<strong>나</strong> 그들에게 술까지 내리게 <strong>한</strong> 秦의 穆公<strong>이</strong> 후에 그 사<br />
람들의 공으로 전쟁에서 <strong>이</strong>김을 말하는 6卷의 「復恩」編의 10章,<br />
吳<strong>나</strong>라 재상으로 있던 袁盎<strong>이</strong> 하녀와 내통하는 신하에게 하녀를 주<br />
었다. 후에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고사<br />
- 87 -
6卷의 「復恩」編의 13章<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를 잘 보여준다.<br />
그뿐 아니라 같은 卷 12章에선 ‘덕<strong>이</strong>란 작다고 그만 둘 것<strong>이</strong> 아니<br />
고 원<strong>한</strong>도 작다고 저질러선 안 된다.’ 57) 고 말하고 있다.<br />
아주 작은 일<strong>이</strong>라도 남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strong>나</strong>중에는 그보다<br />
몇 배 더 큰 보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사람을 대할 때에 함<br />
부로 대하거<strong>나</strong> 해를 끼치지 않기를 강조하며 은연중에 각성을 촉구<br />
하고 있는 것<strong>이</strong>다.<br />
孔子가 길을 가다가 어떤 <strong>이</strong>의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br />
가 심히 비창하였다. <strong>이</strong>에 공자는 「빨리 수레를 몰아라. 어서. 저<br />
앞에 <strong>이</strong>상<strong>한</strong> 분의 울음소리가 있다.」고 재촉하였다.<br />
그에게 가까<strong>이</strong> 다가가 보았더니 丘吾子라는 사람<strong>이</strong>었다. 그는 낫<br />
을 껴안고서 새끼줄로 자신의 몸을 묶은 채 울고 있었다. 공자가<br />
수레에서 내려 물었다. 「선생께서는 무슨 상을 당<strong>한</strong> 것도 아닌데<br />
무엇 때문에 <strong>이</strong>렇게 슬피 우십니까?」<br />
그러자 구오자가 <strong>이</strong>렇게 설명하였다.「<strong>나</strong>에게는 세 가지 과실<strong>이</strong><br />
있습니다.」<br />
공자가 다시 「원컨대 그 세 가지 과실을 듣고 싶소!」라고 하자,<br />
구오자는 <strong>이</strong>렇게 대답하였다.「<strong>나</strong>는 젊어서 학문을 <strong>한</strong>답시고 천하<br />
를 두루 돌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양친<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미<br />
돌아가셨더군요.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의 첫번째 과실입니다. 또 임금을 모시<br />
면서 그 사치스럽고 교만함을 諫言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소. <strong>이</strong><br />
것<strong>이</strong> 두 번째 과실입니다.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뒤<br />
에 끊게 되었습니다.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세 번째 과실입니다.」<br />
<strong>나</strong>무가 고요하고자 하<strong>나</strong> 바람<strong>이</strong> 멎지 아니하고, 자식<strong>이</strong> 부모를<br />
봉양코자하<strong>나</strong> 어버<strong>이</strong>가 기다려 주지 않는군요. 흘러가고는 다시<br />
57)上揭書 6卷「復恩」12章 中 - 故曰德無細, 怨無小, 豈可無樹德而除怨,<br />
務利於人哉!<br />
- 88 -
오지 않는 것, 그것<strong>이</strong> 곧 세월<strong>이</strong>며 <strong>한</strong>번 가면 다시 만<strong>나</strong>볼 수 없<br />
는 것. 그것<strong>이</strong> 부모겠지요. 청컨대 <strong>이</strong>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br />
그리고는 목을 베어 죽어 버렸다. <strong>이</strong>에 공자는 「제자들<strong>이</strong>여 기<br />
록하라 <strong>이</strong>는 족히 경계로 삼을 일<strong>이</strong>로다!」라고 하였다.<br />
그러자 제자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strong>이</strong>를 모신 자가 13人<strong>이</strong><br />
<strong>나</strong> 되었다.<br />
( 孔子行遊中路聞哭者聲, 其音甚悲. 孔子曰 : 「驅之! 驅之! 前有異<br />
人音」少進, 見之, 丘吾子也, 擁鎌帶索而哭. 孔子辟車而下, 問曰 :<br />
「夫子非有喪也, 何哭之悲也?」丘吾子對曰 : 「吾有三失.」孔子曰 :<br />
「願聞三失.」丘吾子曰 : 「吾少好學問, 周遍天下, 還後吾親亡. 一<br />
失也. 事君奢驕, 諫不遂, 是二失也. 厚交友而後絶, 三失也. 樹欲靜乎<br />
風不定, 子欲養乎親不從 : 往而不來者. 年也 ; 不可得再見者, 親也.<br />
請鍾此辭. 」則自刎孔子曰 : 「弟子記之, 此足以爲戒也.」於是弟子<br />
歸養親者十三人. ) 58)<br />
<strong>이</strong>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고사로 자식<strong>이</strong> 봉양하려 하여도 부모는<br />
시절을 기다려 주지 않음을 말하는 風樹之嘆의 고사다.<br />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恭․敬․忠․信을 갖추어야<strong>한</strong>다.<br />
군자는 공경을 좋아하여 그 <strong>이</strong>름을 <strong>이</strong>루고 小人은 공경을 배워 형<br />
벌을 면할 수 있다. <strong>이</strong> 것<strong>이</strong> ≪說苑≫에서 보<strong>이</strong>는 윤리적인 교훈의<br />
根幹<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겠다.<br />
(2). 政治的 側面의 敎訓性<br />
≪說苑≫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내용<strong>이</strong> 거의 대부<br />
분<strong>이</strong>라 하겠다. 특히 왕으로의 도리와 신하로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br />
58) 上揭書 - 「10卷 敬愼 27章」P.446<br />
- 89 -
하여 말하고 있다.<br />
몇몇 고사에서는 괴<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군주의 정치적 역량<br />
과 결부 지어 국가의 흥망성쇠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다. <strong>이</strong>것은 앞<br />
에서도 말<strong>한</strong> 바 있지만 陰陽五行說과 天人感應說의 영향을 받은 것<br />
으로 볼 수 있다. <strong>이</strong>것은 劉向<strong>이</strong> 스승인 董重舒의 영향을 많<strong>이</strong> 받음<br />
을 보<strong>이</strong>고 있기도 하다.<br />
董重舒는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왕은 하늘의 뜻을<br />
<strong>이</strong>어받아 <strong>이</strong>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strong>한</strong>다고 주장하였는데 <strong>이</strong>는<br />
정치적으로 德治에 힘쓰는 것을 말<strong>한</strong>다. 당시에는 천재지변<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괴<br />
<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현상 등<strong>이</strong> 모두 임금의 失德 <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무능력<strong>한</strong> 통치와 결부하여<br />
설명하는 풍조가 있었다 <strong>한</strong>다. 59)<br />
왕은 하늘의 뜻을 <strong>이</strong>어받아 되는 것으로 그 뜻을 잘 지켜 德治를<br />
행해야 하는데 만약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하늘은 노하여 재난과<br />
<strong>이</strong>변을 일으켜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알지 못하면, 괴<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일을 드러<br />
내어 그를 놀라고 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재앙과 화가 일<br />
어<strong>나</strong>게 된다. <strong>이</strong>는 董重舒의 災異說<strong>이</strong> 드러남<strong>이</strong>다. 1卷「君道」篇의<br />
32章에서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잘 드러난다.<br />
그러<strong>나</strong> ≪說苑≫ 대부분의 고사는 앞에서도 말했듯 왕으로의 道理<br />
<strong>이</strong>며 신하로의 道理<strong>이</strong>다. 당시 <strong>이</strong> 책<strong>이</strong> 읽히던 계층과 당시의 시대<br />
상 짐작 할 수 있게 해준다.<br />
왕은 德治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진 사람을 두고 어진 사람을<br />
부리기 위해서는 합당<strong>한</strong> 대우를 해주어야 <strong>한</strong>다. 또 왕은 사람을 부<br />
림에 있어 상주여야 할 때와 벌주어야 할 때를 정확히 알아야 <strong>한</strong>다.<br />
59) 김흥경 편역, 양계초․풍우란 『음양오행설의 연구』서울, 신지서원,<br />
1993<br />
- 90 -
신하는 녹을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하고 임금에게 諫하기를 두려<br />
워하지 않아야 <strong>한</strong>다. 임금을 부모처럼 모셔야 <strong>한</strong>다.<br />
사람을 알아보는 것<strong>이</strong> 임금의 일<strong>이</strong>라면 일을 알아보는 것은 신하<br />
의 도리<strong>이</strong>다.<br />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도 볼 수<br />
있다. 혼란<strong>한</strong> 시대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 보다 과거 역사적<br />
사건들을 보임으로 빗대어 표현 <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 아닌가 <strong>한</strong>다.<br />
또<strong>한</strong> 직접적인 독자층<strong>이</strong> 識者層<strong>이</strong>었음으로 위로는 임금과 위정자<br />
들에게 아래로 서생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는 의도<br />
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晉 平公<strong>이</strong> 봄에 樓臺를 축조하는 토목공사를 벌였다. <strong>이</strong>를 본 叔<br />
向<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서서 諫言하였다. 「안 됩니다. 옛날 성왕들은 덕을 귀히<br />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데에 힘을 썼으며, 형벌을 완화시키고, 백<br />
성을 부릴 때에는 그들의 때를 잘 살폈습니다. 지금은 봄인데 누<br />
대를 짓는다고 공사를 벌<strong>이</strong>시니, <strong>이</strong>는 백성들의 때를 빼앗는 것입<br />
니다. 무릇 덕을 베풀지 않으면 백성<strong>이</strong> 따르지 않는 법<strong>이</strong>요, 형벌<br />
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백성들<strong>이</strong> 근심합니다. 또 임금을 사랑하지<br />
않는 백성을 억지로 부리고, 근심과 원망에 쌓인 백성에게 노역을<br />
시키고, 게다가 그들의 농사지을 때까지 빼앗으시니, <strong>이</strong>는 그들을<br />
거듭 고갈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릇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br />
그들을 양육<strong>한</strong>다는 뜻인데, 도리어 그들을 고갈되게 만드니, <strong>이</strong> 어<br />
찌 명령과 존재를 안전히 하여 후세에 임금<strong>이</strong>란 소리를 들을 수<br />
있겠습니까?」 平公<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좋다」하고는 공사를 중지해<br />
버렸다.<br />
( 晉平公春築臺, 叔向曰 : 「不可. 古者聖王貴德而務施, 緩形辟趨民<br />
時 : 今春築臺, 是奪民時也. 夫德不施, 則民不歸 ; 形不緩, 則百姓<br />
- 91 -
愁. 使不歸之民, 役愁怨之百姓, 而又奪其時, 是重竭也 ; 夫牧百姓,<br />
養育之而重竭之, 豈所以定命安存, 而稱爲人君於後世哉」平公曰:<br />
「善」乃罷築役. ) 60)<br />
<strong>이</strong>처럼 예문에서처럼 諫言을 망설<strong>이</strong>지 않는 신하와 그를 듣고 자<br />
기의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는 임금, <strong>이</strong>것<strong>이</strong> 좋은 정치를 하기 위<br />
<strong>한</strong> 기본 요건일 것<strong>이</strong>다. <strong>이</strong>때 임금은 백성을 향해서 애처롭고 불쌍<br />
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strong>이</strong> 기본<strong>이</strong> 되야 <strong>한</strong>다.<br />
<strong>이</strong>것은 ≪說苑≫의 중심 내용<strong>이</strong>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계속 강조<br />
되는 교훈<strong>이</strong>다.<br />
(3). 敎訓性<strong>이</strong> 주는 시사점<br />
<strong>이</strong>렇듯 ≪說苑≫에는 단순하게 흘리기엔 아까운 교훈적인 내용<br />
<strong>이</strong> 많<strong>이</strong> 실려있다. <strong>이</strong>런 교훈적인 내용들은 불안하고 혼란<strong>한</strong> 시대적<br />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고 정치가 바로<br />
서기를 원하는 작가의 마음<strong>이</strong> 담겨 있는 것<strong>이</strong>다. 소홀하기 쉬운 인<br />
간으로의 도리를 <strong>이</strong>야기하여 개인적으로 인격수양을 또 사회 전체<br />
적으로 도덕적 교화를 꾀<strong>한</strong> 것으로 보인다.<br />
그리고 여러 왕에 관련된 고사를 통해 後代의 왕에게 타산지석의<br />
교훈을 주고 있다. 劉向 자신<strong>이</strong> 諫大夫를 지낸 것과 고사의 내용들<br />
중 諫言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br />
당시 ≪說苑≫은 왕에게도 많<strong>이</strong> 읽히던 책<strong>이</strong> 아니었<strong>나</strong> 생각하게 된<br />
다.<br />
결국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예를 제시하여 정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왕<br />
60) 林東錫 譯註, 1992, ≪說苑≫上․下 東文選 - 「 5卷 貴德 15章」P.184<br />
- 92 -
에 대<strong>한</strong> 권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왕<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군주가 <strong>이</strong>를<br />
보고 정치를 함에 본보기로 삼아 德治를 베풀 것을 기대했다고 볼<br />
수 있겠다.<br />
第2節. 文學的 價値<br />
≪說苑≫은 先秦 <strong>이</strong>전부터 漢初까지의 다양<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를 싣고 있<br />
는데, 대부분의 문장<strong>이</strong> 대화체로 <strong>이</strong>루어져 있어 당시 口語가 상당히<br />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說苑≫은 또 문학적인 면에서도 그 성취가<br />
상당하여 屈守元은 ≪說苑≫의 일부분<strong>이</strong> 중국 고유의 고대 설화 형<br />
식을 갖추고 있어 중국 고대 소설의 발전, 변화를 탐색함에 있어 상<br />
당히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br />
또 앞서 말<strong>한</strong> 대로 설원은 유가의 정치 사상과 윤리관념을 천명하<br />
기 위해 지은 것으로 선진 시대부터 <strong>한</strong> 대까지의 고사를 내용에 따<br />
라 분류하여 각 권의 제목 아래 분류 편집<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다. 대부분 실존하<br />
는 인물의 언행<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어떤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만 그 고사에<br />
서는 志人 小說的인 요소도 보<strong>이</strong>고 있다.<br />
師經<strong>이</strong> 거문고를 연주하자 魏文侯가 일어<strong>나</strong> 부를 지어 말하길 :<br />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을 어기면 가만 두지 않으리.” 하자 사경<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br />
말을 듣고 거문고를 들어 文侯를 쳤는데 몸에는 맞지 않고 면류관<br />
에 맞아 옥구슬<strong>이</strong> 부수어졌다. 文侯가 좌우 신하들에게 묻길 : “신하<br />
된 자가 그 임금을 내리치면 그 죄는 어떠<strong>한</strong>가?” 하자, 신하들<strong>이</strong> 아<br />
뢰길 : “그 죄는 마땅히 烹形에 처해야 하옵니다.” 라고 하였다. 사<br />
경을 끌고 公堂의 계단 하<strong>나</strong>를 내려갔을 때 사경<strong>이</strong> 말하길 : “신<strong>이</strong><br />
<strong>한</strong> 마디 말씀만 올린 뒤에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하자, 文侯가 말<br />
- 93 -
해 보라 하였다. 그래서 사경<strong>이</strong> 말했다 : “옛날 堯와舜 임금은 군주<br />
가 되어 오직 자신<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말을 사람들<strong>이</strong> 어기지 않는 것을 걱정하셨<br />
는데, 桀과 紂는 군주가 되었을 때 오직 자신<strong>이</strong> <strong>한</strong> 말을 사람들<strong>이</strong><br />
어길까 걱정하였으니, 신은 桀과 紂를 친 것<strong>이</strong>지 <strong>나</strong>의 군주를 친 것<br />
<strong>이</strong> 아니옵니다.” <strong>이</strong> 말을 듣고 文侯가 말하였다 : “풀어 주어라. <strong>이</strong><br />
는 과인의 잘못<strong>이</strong>다. 거문고를 성문에 매달아 과인의 표지로 삼을<br />
것<strong>이</strong>며 면류관을 고치지 안고 놔두어 과인의 경계로 삼을 것<strong>이</strong>다.”<br />
(師經鼓琴, 魏文侯起舞, 賦曰 : 「使我言而無見違.」師經琴而撞文侯不<br />
中, 中旒潰之, 文侯謂左右曰 : 「爲人臣而撞其君, 其罪如何?」 左右曰<br />
: 「罪當烹」提師經下堂一等. 師經曰 : 「臣可一言而死呼?」文侯曰 :<br />
「可.」師經曰 : 「昔堯舜之爲君也, 唯恐言而人不違 ; 桀紂之爲君也,<br />
唯恐言而人違之. 臣撞桀紂, 非撞吾君也.」文侯曰 : 「繹之! 是寡人之<br />
過也, 懸琴於城門, 以爲寡人符, 不補旒, 以爲寡人戒」 61)<br />
<strong>이</strong>것은 《韓非子》「難一」과 《淮南子》「齊俗訓」에도 등장<strong>한</strong>다.<br />
그러<strong>나</strong> 두 곳에선 모두 晉 平公과 師曠의 고사로 기록되어 있다. 또<br />
왕<strong>이</strong> 부를 짓고 춤춘 것<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堯舜과 桀紂에 대<strong>한</strong> 언급은 없다. 62)<br />
<strong>이</strong>는 劉向<strong>이</strong> 魏文侯와 師經의 고사로 재창조해 낸 것<strong>이</strong>다. 내용 구<br />
성<strong>이</strong> 앞서 말<strong>한</strong> 두 책의 기록보다 극적<strong>이</strong>고 생동감<strong>이</strong> 넘치는 대화<br />
체로 각색하여 <strong>한</strong>편의 짧은 소설로도 손색<strong>이</strong> 없다고 보여진다.<br />
≪說苑≫의 내용은 뚜렷<strong>한</strong> 교훈성으로 강하여 특별히 오락성<strong>이</strong> 두<br />
드러지지는 않지만 표현 형식 자체에선 志人小說과 비슷<strong>한</strong> 특징을<br />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br />
역사 고사를 위주로 하였으<strong>나</strong> 그 고사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br />
또 명확<strong>한</strong> 주제를 담고 있다. 그리고 짧기는 하지만 표현 수법을 다<br />
양하게 하여 인물 형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간결<strong>한</strong> 언어를<br />
61) 上揭書 - 「1卷 君道 38章」P.46<br />
62) 金長煥,〈魏晉南北朝 志人小說硏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2, P.60<br />
- 94 -
사용하여 인물의 성품과 개성을 표현하고 인물의 내면까지 묘사하<br />
고 있다. 또 실제 있었던 일과 실존 인물의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br />
시간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각 권의 주제에 맞도록 편집 수록하고<br />
있다.<br />
≪說苑≫은 故事集<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格言集으로 교훈적인 성격<strong>이</strong> 강하여 그 자<br />
체를 지인 소설<strong>이</strong>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사의 표현 방법<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미<br />
지인 소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후대의 소설에 끼친 영향은<br />
지대하다고 하겠다.<br />
중국 소설을 논할 때면 《史記》가 빠지지 않는데 사기의 인물 전<br />
기는 내용상 인물을 중심으로 하고있으며 특히 역사적 인물의 풍모<br />
를 비롯하여 그 기질과 내면 심리까지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여 생동<br />
감 있게 묘사하는데 뛰어<strong>나</strong>다.<br />
또 先秦 諸子散文은 각 사상가들과 제자들의 정치철학과 학술사<br />
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안에는 인물의 구체적인 언행<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성격에<br />
대<strong>한</strong> 생동감 넘치는 고사들<strong>이</strong> 다양하다. 또<strong>한</strong> 寓言 63)<strong>이</strong>라는 독특<strong>한</strong><br />
문학형식으로 지인 故事的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것<strong>이</strong> 많다.<br />
그 뒤를 <strong>이</strong>은 劉向의 ≪說苑≫은 《史記》의 歷史故事的 성격과<br />
先秦 諸子散文의 寓言을 적절히 사용하여 故事性을 드러내며 神怪<br />
의 요소를 배제하여 지괴소설의 울타리를 벗어난 지인 소설의 특성<br />
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며 인물의 성경과 언행에 대<strong>한</strong> 묘사수법은<br />
지인 소설의 커다란 창작과 발전에 밑바탕<strong>이</strong> 되었다할 수 있겠다.<br />
歷史書와 諸子書를 잘 합쳐놓은 책과 같다고 생각<strong>한</strong>다. 그러<strong>나</strong> 劉<br />
63) 우언<strong>이</strong>란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아는 <strong>이</strong>솝우화와 같은 종류<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야기다.<br />
그러<strong>나</strong> 중국 우언의 특색은 주인공<strong>이</strong> 사람<strong>이</strong>라는 것<strong>이</strong>며 그 허허로운<br />
세계는 <strong>이</strong>솝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대표적인 우언으로 莊子의 故事들<br />
을 꼽는다.<br />
- 95 -
向 개인의 語錄<strong>이</strong> 아니기 때문에 《菜根談》 64)과도 구별된다고 할<br />
수 있겠다. 다시 말해 ≪說苑≫은 독특<strong>한</strong> 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br />
체를 소설로 보기는 모호하지만 후대의 소설 창작에 큰 영향을 미<br />
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strong>이</strong>라 하겠다.<br />
시대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윤리법칙인 勸善懲惡과 因果<br />
應報는 선<strong>한</strong> 일을 통하여 상을 받고 악<strong>한</strong> 일을 하면 벌을 받게 된<br />
다는 <strong>이</strong>야기다.<br />
因果應報와 勸善懲惡<strong>이</strong> 인생을 사는 基本倫理라 하겠지만 주된 주<br />
제로 孝에 대해 <strong>이</strong>야기하고 있다. <strong>이</strong>는 일반 백성들에게 孝의 중요<br />
성을 강조하고 백성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br />
아주 작은 일<strong>이</strong>라도 타인에게 善을 베풀면 후에 그보다 몇 배 더<br />
큰 보답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여 사람을 대할 때에 함부로 대하거<br />
<strong>나</strong> 해를 끼치지 않기를 강조하며 은연중에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br />
것<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다.<br />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훈성<strong>이</strong> 거의 대부분<strong>이</strong>며 특히 왕으로서의<br />
도리와 신하로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말하고 있다.<br />
몇몇 고사에서는 괴<strong>이</strong><strong>한</strong>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군주의 정치적 역량<br />
과 결부 지어 국가의 흥망성쇠의 징조로 설명하고 있다.<br />
董重舒는 왕은 하늘의 뜻을 받아서 되는 것으로 왕은 하늘의 뜻을<br />
64) 菜根譚 - 중국 明末의 還初道人 洪自誠의 語錄. 내용은 前集 222조는 주<br />
로 벼슬<strong>한</strong> 다음 사람들과 사귀고 직무를 처리하며 임기응변하는 仕官保身의<br />
길을 말하며, 後集 134조는 주로 은퇴 후에 산림에 閑居하는 즐거움을 말하<br />
였다. 합계 356조는 모두 단문<strong>이</strong>며 대구對句를 많<strong>이</strong> 쓴 간결<strong>한</strong> 문장<strong>이</strong>다.<br />
사상적으로는 유교가 중심<strong>이</strong>며, 불교와 도교도 가미되었다. <strong>이</strong> 책은 요컨대<br />
동양적 인간학을 말<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며, 제목인 '채근'은 宋<strong>나</strong>라 汪信民의 《小學》<br />
〈人常能咬菜根卽百事可成〉에서 따온 것<strong>이</strong>다.<br />
- 96 -
<strong>이</strong>어받아 <strong>이</strong>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strong>한</strong>다고 주장하였는데 <strong>이</strong>는<br />
정치적으로 德治에 힘쓰는 것을 말<strong>한</strong>다. 劉向도 董仲舒에게 영향을<br />
받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br />
왕은 하늘의 뜻을 <strong>이</strong>어받고 그 뜻을 잘 지켜 德治를 행해야 하는<br />
데 만약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하늘은 노하여 재난과 <strong>이</strong>변을 일으<br />
킨다. 왕 德治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진 사람을 두어야 하고<br />
어진 사람을 부리기 위해서는 합당<strong>한</strong> 대우를 해주어야 <strong>한</strong>다. 즉 辰<br />
賞受罰<strong>이</strong> 정확해야 <strong>한</strong>다.<br />
신하는 녹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하고 임금에게 諫하기를 두려워<br />
말아야 <strong>한</strong>다. 또<strong>한</strong> 임금을 부모처럼 모셔야 <strong>한</strong>다. 사람을 알아보는<br />
것<strong>이</strong> 임금의 일<strong>이</strong>라면 일을 알아보는 것은 신하의 도리인 것<strong>이</strong>다.<br />
≪說苑≫의 고사들은 혼란<strong>한</strong> 시대적 상황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기<br />
보다 과거 역사 고사를 통해 빗대어 표현 <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라 생각된다. 또<strong>한</strong><br />
직접적인 독자층<strong>이</strong> 식자층<strong>이</strong>었음으로 위로는 임금과 위정자들에게<br />
아래로 서생에 <strong>이</strong>르기까지 전역에 읽혀 온 임금과 백성<strong>이</strong> 유학의<br />
윤리와 사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br />
≪說苑≫에는 단순하게 흘리기엔 아까운 교훈적인 내용<strong>이</strong> 많<strong>이</strong> 실<br />
려있는데 결국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 예를 제시하여 정치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br />
하고 왕에 대<strong>한</strong> 권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왕<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군주가<br />
<strong>이</strong>를 보고 정치를 함에 본보기로 삼아 德治를 베풀 것을 기대했다<br />
고 볼 수 있겠다.<br />
≪說苑≫의 등장 고사는 先秦 <strong>이</strong>전부터 漢初까지의 다양<strong>한</strong> <strong>이</strong>야기<br />
가 실려 있는데, 대부분 문장<strong>이</strong> 대화체로 <strong>이</strong>루어져 있어 당시 구어<br />
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說苑≫은 또 문학적인 면에서도<br />
그 성취가 상당하여 屈守元은 ≪說苑≫의 일부분<strong>이</strong> 중국 고유의 고<br />
대 설화 형식을 갖추고 있어 중국 고대 소설의 발전, 변화를 탐색함<br />
- 97 -
에 있어 상당히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br />
고사들은 그 구성<strong>이</strong> 생동감<strong>이</strong> 넘쳐 <strong>한</strong>편의 짧은 소설로도 손색<strong>이</strong><br />
없다고 본다.<br />
역사 고사 위주지만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고 또 명확<strong>한</strong> 주제를 담<br />
고 있다. 그리고 짧기는 하지만 표현 수법을 다양하게 하여 인물 형<br />
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간결<strong>한</strong> 언어를 사용하여 인물의 성<br />
품과 개성을 표현하고 인물의 내면까지 묘사하고 있다.<br />
≪說苑≫은 故事集<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格言集으로 교훈적인 성격<strong>이</strong> 강하여 그 자<br />
체를 지인 소설<strong>이</strong>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사의 표현 방법<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미<br />
지인 소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후대의 소설에 끼친 영향은<br />
더 <strong>이</strong>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strong>이</strong>다.<br />
劉向의 ≪說苑≫은 《史記》의 歷史故事的 성격과 先秦 諸子散文<br />
의 寓言을 적절히 사용하여 故事性을 드러내며 神怪의 요소를 배제<br />
하여 지괴소설의 울타리를 벗어난 지인 소설의 특성에 매우 근접하<br />
여 있고 인물의 성격과 언행에 대<strong>한</strong> 묘사수법은 지인 소설의 커다<br />
란 창작과 발전에 밑바탕<strong>이</strong> 되었다할 수 있겠다.<br />
- 98 -
第Ⅵ章. 結論<br />
本稿에서는 ≪說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說苑≫의 집<br />
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화 사상적 배경과 작가의 생애 등을 살<br />
펴보았다. 또 ≪說苑≫<strong>이</strong>라는 책<strong>이</strong>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br />
또 그 내용과 체계를 분석함에 있어 篇目上 志人類․志事類․志怪<br />
類로 내용을 분류해 보았고 1卷부터 20卷까지 篇目上 그 내용을 분<br />
류해 보았다. 사상적으로 儒敎的 性格과 道家的 性格으로 분류하여<br />
그 내용과 고사를 정리하였다.<br />
따라서 本稿에서는 ≪說苑≫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br />
해 보았는데 먼저 내용상의 분류를 위해 ≪說苑≫의 故事를 등장하<br />
는 인물 유형별로 <strong>나</strong>눠보았다. 따라서 군주의 형상, 신하의 형상, 군<br />
자의 형상. <strong>이</strong>렇게 세 부분으로 <strong>나</strong>눠보았다.<br />
≪說苑≫은 20권의 각기 다른 篇目을 지니고 있다. 그 篇目의 전체<br />
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중심 내용<strong>이</strong> 잘 드러난 고사를 예로 들어보<br />
려 <strong>한</strong>다.<br />
또 ≪說苑≫의 고사 안에 공통적으로 드러<strong>나</strong>는 사상을 찾아 儒敎<br />
的인 성격의 고사와 道家的인 성격의 고사들로 <strong>나</strong>눠 분류하고자 <strong>한</strong><br />
다. 그리고 劉向의 사상과 철학에 根幹<strong>이</strong> 된 董仲舒의 사상을 살펴<br />
보았다.<br />
대부분의 고사가 志人類에 속<strong>한</strong>다. 왕과 신하 또는 공자와 제자가<br />
주된 등장 인물<strong>이</strong>므로 志人故事가 총 846장의 고사 가운데 거의 전<br />
부를 차지하고 있다. 형식 중에서는 2명 <strong>이</strong>상의 인물<strong>이</strong> 등장하는 대<br />
화문<strong>이</strong> 아닌 왕<strong>이</strong><strong>나</strong> 공자만<strong>이</strong> 등장하여 그들의 언행을 글로 옮겨<br />
놓은 경우도 있다.<br />
篇目으로 분류<strong>한</strong> 것을 간단하게 표로 <strong>나</strong>타내면 아래와 같<strong>이</strong> 정리<br />
- 99 -
할 수 있다.<br />
제목 개수 주된 내용<br />
1卷 君道 25章 왕으로서의 도리와 행위<br />
2卷 臣術 25章 신하로서의 자세<br />
3卷 建本 30章 인간으로의 기본적 도리<br />
4卷 立節 24章 절개를 지닌 선비들의 모습<br />
5卷 貴德 30章 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br />
6卷 復恩 29章 은혜에 보답하고 베푸는 삶<br />
7卷 政理 50章 治國之道에 대해 말함<br />
8卷 尊賢 37章 왕과 신하를 예로 현명함에 대해 말함<br />
9卷 正諫 26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諫言<br />
10卷 敬愼 35章 경계하고 조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br />
11卷 善說 28章 사람들 설득시키는 연설과 말<br />
12卷 奉使 21章 충신들의 모습<br />
13卷 權謀 48章 상황에 맞게 모책을 내놓는 신하들<br />
14卷 至公 22章 현명하여 존경받는 사람들의 고사<br />
15卷 指武 28章 싸움과 전쟁에 대<strong>한</strong> 정의<br />
16卷 談叢 209章 왕부터 여인들까지를 향<strong>한</strong> 권고의 말<br />
17卷 雜言 56章 여러 종류의 고사<br />
18卷 辨物 32章 사건과 사물에 대<strong>한</strong> 견해<br />
19卷 修文 44章 仁과 義가 잘 드러<strong>나</strong>는 수려<strong>한</strong> 문장<br />
20卷 反質 25章 종전과 다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봄<br />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많<strong>이</strong> 등장하는 사람은 단연 왕과 신하<strong>이</strong>다.<br />
그 외에 공자와 제자들<strong>이</strong> 등장<strong>한</strong>다.<br />
각 고사마다 2명<strong>이</strong> 주된 등장인물로 서로 묻고 대답하거<strong>나</strong> 대화하<br />
며 <strong>이</strong>야기를 <strong>이</strong>끌고 있다. 인물에 대<strong>한</strong> 묘사는 그간의 歷史書의 人<br />
物列傳과 비슷하지만 더 극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br />
공자가 등장하는 부분은 논어의 내용과 겹치기는 하지만 그대로<br />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strong>이</strong>는 ≪說苑≫<strong>이</strong> 歷史書<strong>이</strong>기 보다 소설에 더<br />
가까움을 보<strong>이</strong>는 것<strong>이</strong>라 사료된다.<br />
≪說苑≫은 저술 동기부터가 유교의 정치 <strong>이</strong>념과 정치 사상을 천<br />
명하기 위해 저술<strong>한</strong> 것으로 임금에게서는 愛民思想과 德治에 대<strong>한</strong><br />
- 100 -
권고를 신하에게는 임금에 대<strong>한</strong> 忠誠을 일반인에게는 孝에 대해 강<br />
조하고 있다.<br />
몇몇 고사에 노장의 철학<strong>이</strong> 드러<strong>나</strong> 있음은 당시 지식인들<strong>이</strong> 유교<br />
와 함께 노장 철학에 심취하여 있음을 보<strong>이</strong>는 부분<strong>이</strong>다. 하지만 ≪<br />
說苑≫에서는 초기의 巫俗과 方術의 요소는 배제되어 있다.<br />
≪說苑≫에는 교훈적인 내용의 고사가 많<strong>이</strong> 실려있다. <strong>이</strong>런 교훈적<br />
인 내용들은 사회전체의 도덕적 교화를 위<strong>한</strong> 것<strong>이</strong>며 왕과 위정자들<br />
에게 있어서는 옛 왕의 모습들을 통하여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br />
지 못하게 하고 또 배울 것은 배울 수 있도록 정치적 측면에서도<br />
교육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br />
≪說苑≫에 등장하는 고사들은 志怪的 색채가 배제되어 있으며 실<br />
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 과장의 허용되어 있으<br />
며 인물을 기록함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부분을 골라 故事化 하여<br />
소개하고 있다. 또 등장인물의 인물의 성품<strong>이</strong> 잘 묘사되어 인물 형<br />
상을 부각시키고 약간의 위트와 풍자를 담고 있다.<br />
<strong>이</strong>는 흑과 백을 <strong>나</strong>누듯 정확하게 양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說<br />
苑≫<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미 志人小說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다.<br />
다시 말해 志人小說의 특성에 매우 근접하였으며 후의 志人小說<br />
창작에 커다란 밑바탕<strong>이</strong> 된 것을 부정 할 수 없다..<br />
本稿에서는 ≪說苑≫의 내용과 체제에 대해 주력하여 분석을 하였<br />
다. 하지만 ≪說苑≫의 교훈적<strong>이</strong>며 흥미로운 <strong>이</strong>야기들<strong>이</strong> <strong>이</strong>전의 歷<br />
史書가 志人小說로 연결되는 지점에의 문학사적인 위치에 대<strong>한</strong> 연<br />
구가 부족<strong>한</strong>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strong>한</strong>다.<br />
앞으로는 ≪說苑≫에 대<strong>한</strong>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br />
며 ≪說苑≫<strong>이</strong>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바란다.<br />
- 98 -
참고 문헌<br />
劉向 著, ≪說苑≫, 臺灣常務印書館<br />
劉向 著, 盧元駿 譯註, ≪說苑今註今譯≫, 臺灣常務印書館, 民國77<br />
劉向 著, 林東錫 譯, ≪說苑≫, 서울, 東文選, 1996<br />
劉向 著, 馬遠․顧復生 譯註, ≪新書․說苑 選譯≫, 人民大學出版社,<br />
北京, 1991<br />
金學主 著, 『中國古代文學史』,서울, 민음사, 1993<br />
丁範鎭 ․ 河正玉 著 『中國文學史』, 서울, 동아학연사, 1982<br />
金學主․ 李東鄕 著 『中國文學史 Ⅰ․Ⅱ』, 서울, <strong>한</strong>국방통대 출판<br />
부, 1985<br />
全寅初 著, 『中國古代小說硏究』,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1985<br />
魯迅 著, 丁範鎭 譯 , 『中國小說史略』, 서울 , 학연사, 1987<br />
中國小說硏究會 編, 『中國小說史의 理解』, 서울, 학고방 , 1998<br />
中國哲學會, 『歷史 속의 中國 哲學』, 서울 , 예문서원, 1999<br />
류성태 著, 『중국철학사』익산, 원광대학교출판국, 2000<br />
中國哲學會 著, 『역사 속의 중국철학』, 서울 , 예문서원, 1999<br />
林明花, 〈《說苑》에 <strong>나</strong>타난 동사 '問'의 용법〉, 中語中文學 28,<br />
2001<br />
林明花, 〈《說苑》에 <strong>나</strong>타난 被動文 考察〉, 東新大學校人文科學硏<br />
究所,人文論叢, 1997<br />
全寅初, 〈中國小說觀念의 演變考譯〉, 서울, 延世論叢 제 19집, 연세<br />
대학교<br />
金長煥,〈《世說新語》의 國內 流傳狀況과 硏究槪況〉, 延世大學校<br />
國學硏究院 東方學志, 1999<br />
金民那,〈《世說新語》에 표현된 魏晋名士의 審美觀 :「賞譽篇」을<br />
- 88 -
중심으로〉, 韓國中國學會 中國學報 제45집, 2002<br />
정<strong>한</strong>균, 〈董仲舒 災異說의 信仰形態的 硏究〉,《<strong>한</strong>국종교사연구》<br />
11권, <strong>한</strong>국종교사학회, 2003<br />
김동민, 〈董仲舒 春秋學의 天人感應論에 대<strong>한</strong> 考察 - 祥瑞․災異說<br />
을 中心으로 〉《동양철학연구》36권, 동양철학연구회 2004<br />
남상호, 〈董仲舒 天人感應의 方法〉,《범<strong>한</strong>철학》22, 범<strong>한</strong>철학회,<br />
2001<br />
<strong>이</strong>연승, 〈董仲舒 硏究史〉, 《<strong>한</strong>국종교연구회 회보》8권, <strong>한</strong>국종교<br />
연구소, 1999<br />
尹賢伊 , 〈《搜神記》의 교훈성에 관<strong>한</strong> 연구〉, <strong>한</strong>림대학교 석사논<br />
문, 1999<br />
朴秀娟, 〈中國의 家父長制와 傳統女性象의 葛藤構造 硏究-劉向의<br />
《列女傳》을 中心으로〉,<strong>한</strong>국외대 석사논문, 2002<br />
趙貞淑, 〈《列女傳》分析 및 國內收用 硏究〉, 경희대학교 석사논<br />
문, 2003<br />
金長煥, 〈《世說新語》創作의 小說史的 背景과 志人小說의 特性〉,<br />
연세대 중어중문학회, 1991<br />
宋倫美,〈《搜神記》硏究〉,성균관대 석사논문, 1989<br />
강종임, 〈《搜神記》世界觀 硏究〉, <strong>이</strong>화여대 석사논문, 1993<br />
崔正淑, 〈《搜神記》에 <strong>나</strong>타난 鬼․神․人의 關係 硏究〉, 경희대<br />
석사논문, 2002<br />
李在弘, 〈《世說新語》內容과 言語特性 硏究〉, 외국어대 석사논문,<br />
1996<br />
金長煥, 〈《世說新語》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br />
金鎭玉, 〈《世說新語》에 대<strong>한</strong> 一考察 / 淸談과 관련하여〉,서강대<br />
석사논문 , 1984<br />
李賢九, 〈莊子의 哲學思想에 관<strong>한</strong> 연구 「逍搖遊」「齊物論」중<br />
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83<br />
- 89 -
卞貴南,〈六朝 佛敎類 志怪小說 硏究〉, 영남대 박사논문, 2001<br />
金長煥, 〈魏晉南北朝 志人小說硏究〉, 연세대 박사논문, 1992<br />
林明和, 〈≪說苑≫의 語法構造 硏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8<br />
金鎭永,〈《世說新語》人物品評 硏究: 主要人物 中心으로〉, 성균관<br />
대 박사 논문 , 2003<br />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