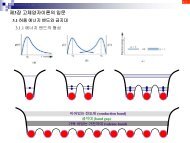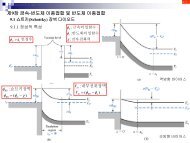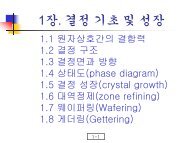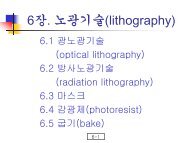- 41 -2) 술어 논항 도식:명제들의 그물조직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식 표상들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며,모두 그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된 <strong>이</strong>유들 때문에,그 어느 것도 우리 목적을 위<strong>해</strong>서 그 자체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명제들의 그물조직은,그것들의 장점을 결합하고 확장하며, 일부 그것들의 한계를 피<strong>해</strong> 가는 한 가지 대안을 제공<strong>해</strong> 준다.술어 논항 도식(predicateargument schema) 은65) 언어의 기본단위로 간주될 수 있다.보통 그것은 명제(proposition) 로 언급된다. 원래 논리학으로부터 빌려온 용어<strong>이</strong>지만,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 66) 덩잇글 표상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명제는 간단히 술어논항도식으로 된다.원자명제들(atomic propositions)( 가령 Kintsch, 1974) 은 관계용어인 술어와 하나 <strong>이</strong>상의논항들로 <strong>이</strong>뤄진다.<strong>이</strong>는PREDICATE[ARGUMENT, ARGUMENT, ...]술어[ 논항, 논항, ...]과 같<strong>이</strong> 씌어진다. 술어는 논항 홈들,참여요소들의 의미 역할을 채워 줄 수 있는 논항들의숫자와 종류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술어 GIVE(주다)는GIVE[agent: MARY, object: BOOK, goal: FRED]주다[행위주: 매뤼, 대상: 책, 목표: 프뢰드]에서와 같<strong>이</strong> 세 개의 논항 홈을 지닐 수 있다. 67)원자명제는 또 다른 명제 내부에 하나의65) 술어와 논항<strong>이</strong>란 용어는 프레게(Frege, 1879) 의 “ 개념 문자”( 또는 순수사고 표기법) 에서 나온 것<strong>이</strong>다.그곳에서는 술어가 함수(function) 로 언급되었다 . ‘ 술어 논항’ 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 집합 원소’의 관계를 근거로 한다. 임의의 원소가 어떤 집합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지기(argue) 때문에 논항(argument) <strong>이</strong>라고 부르는데 , 폴란드 논리학자들은 자리(place) 라고 불렀다. 술어 논항 구조에 양화(quantification)관계가 도입된 것을 술어 논리(predicate logic) 라고 부른다. 자연언어는 논항의 숫자가 하나에서 셋까지 분포한다 . 만일 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면 임의의 논항<strong>이</strong> 반복되어 확장될 수 있다. 하<strong>이</strong>주눗 ( 편)(Heijenoort 1967). 프레게로부터 괴델까지:1879년부터 1931 년까지 수리논리학에서의 자원 독본(From Frege to Gödel: A Source Book inMathematical Logic 1879~1931 )(Harvard Univ. Press) 에 들어 있는 영역본 “ 개념 표기법( 개념 문자):순수사고를 위하여 산술의 형식언어에 모형을 둔 한 가지 형식언어 Begriffsschrift, a formula language, modeledupon that of arithmetic, for pure thought” 를 참고하기 바란다.schema( 도식, 개념틀) 은 원래 바틀릿(Bartlett, 1932, 1995 재판: 199 쪽 <strong>이</strong>하) 기억하기 : 실험심리학과 사회심리학 연구(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Cambridge UniversityPress) 에서 제안된 용어<strong>이</strong>다 . 현재 심리학에서는 그림과 공식을 아우른 ‘ 도식’( 圖 式 ) 으로 통일<strong>해</strong>서 쓰고 있다.<strong>이</strong> 번역에서도 <strong>이</strong>를 존중하여 따른다. 그렇지만 정작 문제는 논항과 술어로 <strong>이</strong>뤄진 명제도 schema 의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또한 schema 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우리의 경험<strong>이</strong> 누적됨에 따라 가변적<strong>이</strong>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 도식’ <strong>이</strong>란 말은 적합하지 않다. 김지홍은 대신 ‘ 개념틀’ 또는 ‘ 개념틀 지식’<strong>이</strong>란용어를 쓰고 있다. 여기서 일단 ‘ 도식’ <strong>이</strong>란 번역 용어에 문제가 깃들어 있음을 지적<strong>해</strong> 둔다.66) < 원저자 각주 4> 일부 차용자들은 원래의 논리학 영역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서 나돌아 다니려고 하지 않았다( 가령 Bierwisch, 1969; van Dijk, 1972). 그러나 원래의 논리적 의미와 혼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킨취(Kintsch, 1974) 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 용어의 의미를 확대하여 써 왔다.67) 임의의 명제는 자기 ‘ 안/ 밖’ 에서 반복을 통하여 무한하게 늘어날 수 있다. <strong>이</strong>를 recursion( 반복, 회귀)라고 부른다. <strong>이</strong>런 무한 확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수의 확장( 자기 밖에서의 반복<strong>이</strong>며 , 엄격한 등위접속의 구현임)<strong>이</strong>다. 프레게(1884). ( 박준용ㆍ최원배)( 옮김)(2003).산수의 기초( 아카넷) 을 보기 바란다.언어학에서는 자기안에서의 반복을 ‘ 내포’(embedding) 라고 부르며, 자기 밖에서의 반복을 ‘ 접속’(conjunction) <strong>이</strong>라고 부른다.담
- 42 -명제를 내포시켜 줌으로써 68)GIVE[agent: MARY, object: OLD[BOOK], goal: FRED]주다[행위주: 매뤼, 대상: 오래된[ 책], 목표: 프뢰드]또는INADVERTENTLY[GIVE[agent: MARY, object: OLD[BOOK], goal: FRED]]부주의하게[ 주다[행위주: 매뤼, 대상: 오래된[ 책], 목표: 프뢰드]]에서와 같<strong>이</strong> 수정될 수 있다.복합명제(complex propositions)(van Dijk & Kintsch, 1983) 는 핵심 명제 의미에 종속된여러 개의 원자명제들로 <strong>이</strong>뤄진 합성체<strong>이</strong>다.복합명제에 대한 일반적인 도식은 다음처럼 주어진다.범주 ( 행위, 사건, 상태):├ 술어:└ 논항( 행위주, 대상, 근원, 목표,…):│└ 수식어:환경:├ 시간:└ 장소:따라서“Yesterday, Mary gave Fred the old book in the library.”( 어제, 도서관에서 매뤼는 그 오래된 책을 프뢰드에게 건네 주었다)는 다음과 같<strong>이</strong> 표상될 것<strong>이</strong>다.┌ 행위:│ ├ 술어: 주다│ └ 논항:│ ├ 행위주: 매뤼│ ├ 대상: 책│ │ └ 수식어: 오래된│ └ 목표: 프뢰드│└ 환경:├ 시간:└ 장소:어제도서관화의 전개 방식도 우리 사고의 전개도 엄격히 내포 또는 접속의 구현으로 <strong>이</strong>뤄진다.68) <strong>이</strong> 책의 저자는 명제의 표상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쓰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를 ‘ 술어’의지위로 놓고 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명제에서는 또한 문장 부사를 ‘ 술어’ 의 지위로 보고 있다. 엄격하게 ‘ 술어 [ 논항]’ 의 형식을 준수한다면 ,‘ 오래되다 [ 책]’‘ 아니[ 주의하다 [ 주다 …]]’처럼 표상되어야 할 것<strong>이</strong>다 여기서는 저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각각 형용사 형용사로 된 관형어 와 부사를 그. ( )대로 살려 둔다.
- Page 1: 이 해: 인지 패러다임월터
- Page 5 and 6: - 5 -97. 학생들을 수업용
- Page 7 and 8: 탐구하도록 하는, 어떤 일
- Page 9 and 10: 그들의 헌신과 열정, 실험
- Page 11 and 12: - 2 -사고에 대한 연구는 다
- Page 13 and 14: - 4 -것들을 좀 더 정확히
- Page 15 and 16: - 6 -험ㆍ주어진 지각상황
- Page 17 and 18: - 8 -확산기제에 의해서 명
- Page 19 and 20: - 10 -하는 인지 신경과학
- Page 21 and 22: - 12 -ㆍ일까?덩잇글의 일관
- Page 23 and 24: - 14 -
- Page 25 and 26: - 16 -인지과학과 인지심리
- Page 27 and 28: - 18 -어떤 연산들은 한 영
- Page 29 and 30: - 20 -몸짓시늉(gesture) 이 상
- Page 31 and 32: - 22 -야기(narrative) 로 된 정
- Page 33 and 34: - 24 -과는 거리가 멀다. 헐(
- Page 35 and 36: - 26 -과 관련된 사안에 대
- Page 37 and 38: - 28 -구에 대한 간결한 요
- Page 39 and 40: - 30 -자도 타격에 대해 과
- Page 41 and 42: - 32 -기억흔적들(exograms) 도
- Page 43 and 44: - 34 -어, 커피 주전자 이용
- Page 45 and 46: - 36 -기 표상들에 엄밀히
- Page 47 and 48: - 38 -Rosch & Mervis, 1975; Smith &
- Page 49: - 40 -와 같은 문장들에 대
- Page 53 and 54: - 44 -P1P2P3P4P5GIVE[MARY, P3, FRED
- Page 55 and 56: - 46 -의미 그물조직에서 BIR
- Page 57 and 58: - 48 -때문이다.그러나 비록
- Page 59 and 60: - 50 -TRAVEL[agent: JOHN, instrumen
- Page 61 and 62: - 52 -
- Page 63 and 64: - 54 -2 절에서 저자는 지식
- Page 65 and 66: - 56 -헨티나에 대해서는 많
- Page 67 and 68: - 58 -비 교브라질아르헨지
- Page 69 and 70: - 60 -비록 어떤 형식적 분
- Page 71 and 72: - 62 -어에 의해서 구체화될
- Page 73 and 74: - 64 -치명적이다[ 심장마비
- Page 75 and 76: - 66 -그렇지만 부정 명제가
- Page 77 and 78: - 68 -John left early. This shocked
- Page 79 and 80: - 70 -지만,그것들은 연구자
- Page 81 and 82: - 72 -또한 근원(“from the bod
- Page 83 and 84: - 74 -E25:andE17의 새 명제E26:f
- Page 85 and 86: - 76 -실질적으로 이런 자세
- Page 87 and 88: - 78 -Dijk & Kintsch, 1983) 에 의
- Page 89 and 90: - 80 -서는 간략히 요약만
- Page 91 and 92: - 82 -(5) The comedian supplied gla
- Page 93 and 94: - 84 -까지 이뤄진 모의들은
- Page 95 and 96: - 86 -의미를 구성하며 효과
- Page 97 and 98: - 88 -목표:장기기억:붉다[
- Page 99 and 100: - 90 -들에 대해서 아주 정
- Page 101 and 102:
- 92 -다시 말하여 실제적으
- Page 103 and 104:
- 94 -인출된품목수시 간[
- Page 105 and 106:
- 96 -제로 분석하거나 그
- Page 107 and 108:
- 98 -낱말 행렬에 의한 거
- Page 109 and 110:
이 하는 만큼 거의 동일한
- Page 111 and 112:
지식 표상으로서 명제 그
- Page 113 and 114:
언어는 여러 세기 동안 연
- Page 115 and 116: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 Page 117 and 118:
않는 경우에는 흔히 직접
- Page 119 and 120:
은 더욱 강해진다. 반면에
- Page 121 and 122:
더해짐에 따라 즉각적으로
- Page 123 and 124:
상황모형의높음BB&F(1972)완
- Page 125 and 126:
(5) A turtle sat on a log. A fish s
- Page 127 and 128:
어떤 심상이 형성될 것이
- Page 129 and 130:
그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 Page 131 and 132:
GROCERYSHOPPING(식품점 장
- Page 133 and 134:
ㆍ식품점 장보기(GROCERYS
- Page 135 and 136:
조점을 덩잇글 자체로부터
- Page 137 and 138:
- 128 -
- Page 139 and 140:
- 130 -
- Page 141 and 142:
51.낱말 의미들의 구성뉴
- Page 143 and 144:
임시저장고들의 내용은 의
- Page 145 and 146:
밀리초(¹/₁ 000초)망막 위
- Page 147 and 148:
닌다.독자 및 청자로서 우
- Page 149 and 150:
담화에서 낱말 확인에 대
- Page 151 and 152:
추론에 대한 증거는 틸ㆍ
- Page 153 and 154:
두 개의 표적 낱말이 동일
- Page 155 and 156:
표 52> 어떤 덩잇글과 명
- Page 157 and 158:
맥락과 독립하여 일어난다
- Page 159 and 160:
슈와는플루글ㆍ화잍(Schwane
- Page 161 and 162:
한 점화 효과를 둘 모두 동
- Page 163 and 164:
그것 나름의 고유한 어떤
- Page 165 and 166:
criminal( 범인) slip( 빠져나
- Page 167 and 168:
과정들에 참여하게 만듦으
- Page 169 and 170: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뒤
- Page 171 and 172:
she Jane pours a Coke( 그녀제인
- Page 173 and 174:
신속히 확인되지만, 여전
- Page 175 and 176:
가 수행되어야 할 듯하다.
- Page 177 and 178:
첫째, 다음 은유를 살펴보
- Page 179 and 180:
나온 연결 강도로 기여하
- Page 181 and 182:
표 55> 예문 (7a) 와 (7b) 의
- Page 183 and 184:
(LSA) 공간에서 그것들의 벡
- Page 185 and 186:
- 176 -
- Page 187 and 188:
용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 Page 189 and 190:
을 생성할 수 있다. 이해
- Page 191 and 192:
(3) The janitor cleaned the room wi
- Page 193 and 194:
이었다. 마찬가지로 예문(6
- Page 195 and 196:
룃클맆ㆍ먹쿤(Ratcliff & McKoo
- Page 197 and 198:
흥미롭다. 피험자들에게
- Page 199 and 200:
흥미로운 상호작용을 관찰
- Page 201 and 202:
자들이 그것을 얼마나 잘
- Page 203 and 204:
강도 냉각 명제■ 가열 명
- Page 205 and 206:
락 2) 으로 이뤄진 작은 이
- Page 207 and 208:
DRIVE(J,CAR)/1.12운전하다 ( 존
- Page 209 and 210:
과정에 대해서는 적합하다
- Page 211 and 212:
여기에서 명제에 의해 정
- Page 213 and 214: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
- Page 215 and 216:
묵시적 조건에서 약간이지
- Page 217 and 218:
(SOA) 를 이용하였다. 그들
- Page 219 and 220:
고, 세 번 제시 뒤에는 2.36
- Page 221 and 222:
자들은 그 물건이 동일한
- Page 223 and 224:
그 생각이 즉각 모든 방향
- Page 225 and 226:
흔히 가락과 운율이 완벽
- Page 227 and 228:
과 관련된다. 의미상으로
- Page 229 and 230:
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들
- Page 231 and 232:
에서 즐길 수 있지만, 심층
- Page 233 and 234:
사람들이 한 상황에서 얼
- Page 235 and 236: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
- Page 237 and 238:
준의 집단으로 부호화하기
- Page 239 and 240:
달라진다. 전통적인 실험
- Page 241 and 242:
덩잇글에 대한 이해는 의
- Page 243 and 244:
한밤중에 [ 영 대용] 어느
- Page 245 and 246:
심지어 검사 낱말 robbery(
- Page 247 and 248:
이 의미 연결이 이뤄지지
- Page 249 and 250:
기 작업기억이 형성되는
- Page 251 and 252:
74]) 처럼 그들이 ‘ 참고
- Page 253 and 254:
마찬가지로 만일 예문 (6)
- Page 255 and 256:
1939). 그렇지만 그런 자료
- Page 257 and 258:
the lawyer( 그 변호사에 의해
- Page 259 and 260:
안정되며 잘 연습되고 자
- Page 261 and 262:
◇ 제7장의 요약 ◇제7 장
- Page 263 and 264:
본질적으로 손쉬운 것들이
- Page 265 and 266:
다 우월하지 않음이 명백
- Page 267 and 268:
“ 예”확률부적합한 새
- Page 269 and 270:
문장 재인 실험은 근본적
- Page 271 and 272:
길런드ㆍ쉬프륀(Gillund & Shi
- Page 273 and 274:
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물
- Page 275 and 276:
표 82>옛 문장 검사의 경
- Page 277 and 278:
이들 예측은 앞에서 본 [
- Page 279 and 280:
라도), 실제 모의 내용에서
- Page 281 and 282:
The first frog wanted to enter the
- Page 283 and 284:
로 4 ∼8 개의 원자명제 사
- Page 285 and 286:
표 88>구두쇠 이야기에 대
- Page 287 and 288:
그렇지만 문장 재인의 사
- Page 289 and 290:
등과 같은 이야기 도식(sche
- Page 291 and 292:
Dijk, 1980). 하지만 다른 두
- Page 293 and 294:
과 코사인 값 사이의 전반
- Page 295 and 296:
91. 무엇이 유능한 독자를
- Page 297 and 298:
모든 것을 덜 중요한 것으
- Page 299 and 300:
을 채택함을 보여 주었다.
- Page 301 and 302:
회상백분률높음 낮음 높음
- Page 303 and 304:
“ 덩잇글로부터 얻어진
- Page 305 and 306:
⑵ 덩잇글은 보통 실세계
- Page 307 and 308:
덩잇글 기반과 상황모형…
- Page 309 and 310:
구조가 관련영역 전문가에
- Page 311 and 312:
뜬 경로 탐색자(Pathfinder)
- Page 313 and 314:
연상이 덩잇글 구조와 부
- Page 315 and 316:
아니다. 그러나 현재 목적
- Page 317 and 318: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예
- Page 319 and 320:
명시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 Page 321 and 322:
브뤼튼ㆍ걸고즈(Britton & Gul
- Page 323 and 324:
위와 덩잇글 의미연결( 원
- Page 325 and 326:
한 상호작용을 드러낸다.
- Page 327 and 328:
(Britton & Gulgoz, 1991)의 월남
- Page 329 and 330:
누락 철자 과제는 회상에
- Page 331 and 332:
실제 사례가 아니었다면,
- Page 333 and 334:
취(Wolfe, Schreiner, Rehder, Laham
- Page 335 and 336:
학습점수학습 질문지학습
- Page 337 and 338:
독자는 학습을 위하여 언
- Page 339 and 340:
- 330 -
- Page 341 and 342:
사람들은 읽기에 많은 시
- Page 343 and 344:
How many sticks does Tome have?조
- Page 345 and 346:
표 101>진술형 산술문제의
- Page 347 and 348:
ㆍ 시작 집합 S1: 대상:구슬
- Page 349 and 350:
우리의 모의 내용을 놓고
- Page 351 and 352:
의 자료에서는 오류가 모
- Page 353 and 354:
으로 뺄셈을 가리킨다. 그
- Page 355 and 356:
히려 낮은 상관관계는 약
- Page 357 and 358:
결과만 살펴본다면, 그 이
- Page 359 and 360:
올바른가설선택의백분율
- Page 361 and 362:
[ 그림 106a], [ 그림 106b],
- Page 363 and 364:
탐이 구슬을제프가 탐에게
- Page 365 and 366:
을 분석한 내용에 근거를
- Page 367 and 368:
제시된 대수문제 덩잇글은
- Page 369 and 370:
라스 정리, 그리고 원과 다
- Page 371 and 372:
의 비행시간이 비행기2의
- Page 373 and 374:
문이다(Larkin 1989). 그렇지
- Page 375 and 376:
동영상처리동영상그물조
- Page 377 and 378:
◇ 제10장의 요약 ◇대수
- Page 379 and 380:
앞의 제10 장에서 계발된
- Page 381 and 382:
(2) 요구를 진술한( 가령 ‘
- Page 383 and 384:
를( 산출결과 Y)Y 라는 결과
- Page 385 and 386:
( 덩잇글^ 편지)에 결속되
- Page 387 and 388:
상황에 반응한다, 등등. 그
- Page 389 and 390:
여러 사례를 놓고서 NETWORK(
- Page 391 and 392:
관찰을 하였다. 초보 및 중
- Page 393 and 394:
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 Page 395 and 396:
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우
- Page 397 and 398:
그런 복잡한 문제해결 행
- Page 399 and 400:
이 도표에서는 다양한 구
- Page 401 and 402:
의 업적을 놓고서 구성
- Page 403 and 404:
[ 그림 118]하노이 탑 문제
- Page 405 and 406:
에는 경계선이 있다.그 경
- Page 407 and 408:
형은 더욱 많이 활성화된BA
- Page 409 and 410: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어
- Page 411 and 412:
관찰됨 0.9269백인 0.5533누군
- Page 413 and 414:
현상4:치지 않는다.고정관
- Page 415 and 416:
이용하여 신체의 상태를
- Page 417 and 418:
더 정확히 표현하여, 그것
- Page 419 and 420: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는
- Page 421 and 422:
적 서술방식이 BAD(나쁨) 마
- Page 423 and 424:
그렇지만 높은 수준의 활
- Page 425 and 426:
도움을 줄 수 있다.광범위
- Page 427 and 428:
들이 없이도 인지 이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