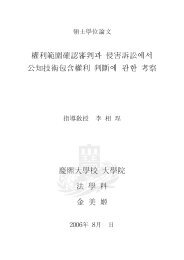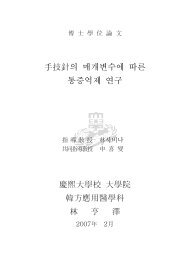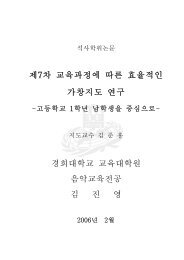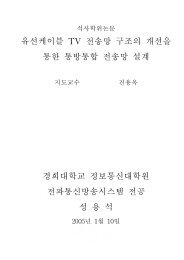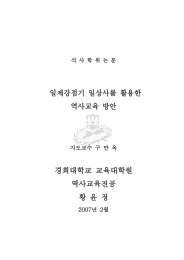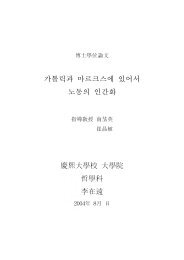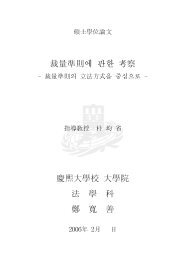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승<strong>이</strong>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사람<strong>이</strong>라면 그는 매우 행복<strong>한</strong> 사람일 것<br />
<strong>이</strong>다.<br />
요즘 사회적으로 멘토라는 말<strong>이</strong> 매우 유행하고 있다. 지식만을 전<br />
달하는 스승<strong>이</strong> 아니라 정신적인 스승을 말하는 것인데 아마 劉向에<br />
게는 董仲舒가 그러<strong>한</strong> 인물<strong>이</strong>었으리라 생각된다.<br />
동중서는 兩漢 혹은 적어도 西漢을 대표하는 학자임을 부정하는<br />
<strong>이</strong>가 거의 없고 중국 사상사<strong>나</strong> 문학사를 다루는 전문적인 서적에서<br />
도 빠짐없<strong>이</strong> 다루어지는 중요<strong>한</strong> 인물<strong>이</strong>다.<br />
董仲舒는(기원전 179~104)는 서<strong>한</strong> 시대의 유학자<strong>이</strong>며 정치가<strong>이</strong>다.<br />
河北省 廣州사람으로 일생동안 公羊春秋學을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br />
사람들<strong>이</strong> “漢代의 孔子”라 불릴 만큼 사람됨<strong>이</strong> 兼直하였으며 학문에<br />
博通하였다고 <strong>한</strong>다. 현재 남아 있는 동중서의 대표적 저술은 《春秋<br />
繁露》<strong>이</strong>다. 중요사상은 천인관계, 즉 天人感應論<strong>이</strong>다. 그는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천인감응론을 음양오행학설을 통해 더욱 더 체계화, <strong>이</strong>론화 시켰다.<br />
그의 사상에 의하면 오직 인간만<strong>이</strong> 하늘과 감응할 수 있다고 보았<br />
다. 그 <strong>이</strong>유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명을 부여받은 존재<strong>이</strong>며 하늘의<br />
음양지기는 인간에게도 동기로서 존재하기 때문<strong>이</strong>다.<br />
동중서 천인감응론의 실제적 의도는 공자의 《春秋》를 발휘하는<br />
것에 있었다. 그는 《春秋》를 통해 ‘하늘과 인간의 상호 관계지음’<br />
을 말함으로 「奉天法古」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strong>이</strong> 있었다. 즉 《春<br />
秋》에 기록된 과거역사경험을 통해 하늘의 의지를 살피고 <strong>이</strong>러<strong>한</strong><br />
의지를 군왕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실현시키는데 있었다고 할 수<br />
있다.<br />
災異중 <strong>나</strong>타난 천인감응은 강력<strong>한</strong> 천의 의지와 함께 역사의 교훈<br />
<strong>이</strong> 함께 들어 있어 동중서의 역사의 교훈을 통해 천의가 깊<strong>이</strong> <strong>나</strong>타<br />
<strong>나</strong>있음 경험하였다. 그는 그러<strong>한</strong> 경험을 통해 자신의 독특<strong>한</strong> 학문<strong>이</strong><br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