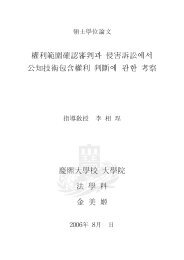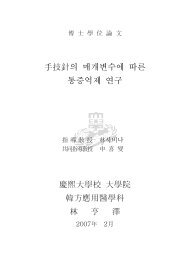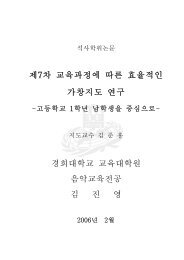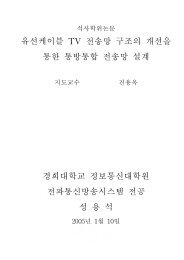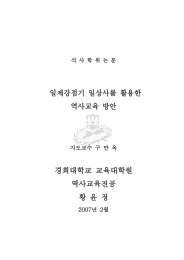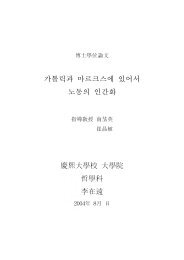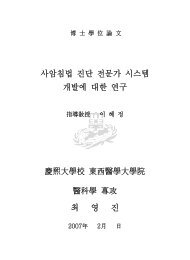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劉向의《說苑》硏究 慶熙大學校 敎育大學院 中國語敎育專攻 이 한 나
- No tags were found...
You also want an ePaper? Increase the reach of your titles
YUMPU automatically turns print PDFs into web optimized ePapers that Google loves.
오지 않는 것, 그것<strong>이</strong> 곧 세월<strong>이</strong>며 <strong>한</strong>번 가면 다시 만<strong>나</strong>볼 수 없<br />
는 것. 그것<strong>이</strong> 부모겠지요. 청컨대 <strong>이</strong> 말을 잘 따라 주십시오!」<br />
그리고는 목을 베어 죽어 버렸다. <strong>이</strong>에 공자는 「제자들<strong>이</strong>여 기<br />
록하라 <strong>이</strong>는 족히 경계로 삼을 일<strong>이</strong>로다!」라고 하였다.<br />
그러자 제자들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어버<strong>이</strong>를 모신 자가 13人<strong>이</strong><br />
<strong>나</strong> 되었다.<br />
( 孔子行遊中路聞哭者聲, 其音甚悲. 孔子曰 : 「驅之! 驅之! 前有異<br />
人音」少進, 見之, 丘吾子也, 擁鎌帶索而哭. 孔子辟車而下, 問曰 :<br />
「夫子非有喪也, 何哭之悲也?」丘吾子對曰 : 「吾有三失.」孔子曰 :<br />
「願聞三失.」丘吾子曰 : 「吾少好學問, 周遍天下, 還後吾親亡. 一<br />
失也. 事君奢驕, 諫不遂, 是二失也. 厚交友而後絶, 三失也. 樹欲靜乎<br />
風不定, 子欲養乎親不從 : 往而不來者. 年也 ; 不可得再見者, 親也.<br />
請鍾此辭. 」則自刎孔子曰 : 「弟子記之, 此足以爲戒也.」於是弟子<br />
歸養親者十三人. ) 58)<br />
<strong>이</strong>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고사로 자식<strong>이</strong> 봉양하려 하여도 부모는<br />
시절을 기다려 주지 않음을 말하는 風樹之嘆의 고사다.<br />
몸을 세우고자 하는 자는 恭․敬․忠․信을 갖추어야<strong>한</strong>다.<br />
군자는 공경을 좋아하여 그 <strong>이</strong>름을 <strong>이</strong>루고 小人은 공경을 배워 형<br />
벌을 면할 수 있다. <strong>이</strong> 것<strong>이</strong> ≪說苑≫에서 보<strong>이</strong>는 윤리적인 교훈의<br />
根幹<strong>이</strong>라 할 수 있겠다.<br />
(2). 政治的 側面의 敎訓性<br />
≪說苑≫에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주는 내용<strong>이</strong> 거의 대부<br />
분<strong>이</strong>라 하겠다. 특히 왕으로의 도리와 신하로의 도리를 엄격히 구분<br />
58) 上揭書 - 「10卷 敬愼 27章」P.446<br />
- 89 -